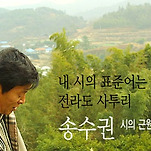<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r1z/0a052f0015ea6156c96eb0b4f17512545202326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r1z/0a052f0015ea6156c96eb0b4f175125452023267" data-origin-width="823" data-origin-height="544"></div><p>&#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送信송신 / 신동집(1924-2003)</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바람은 한로의</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음절을 밟고 지나간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귀뚜리는 나를 보아도</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이젠 두려워하지 않는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차운 돌에 수염을 착 붙이고</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멀리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어디선가 받아 읽는 가을의 사람은</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일손을 놓고</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한동안 멍하니 잠기고 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귀뚜리의 송신도 이내 끝나면</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하늘은 할 수 없는</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청자의 심연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무덥던 여름도 寒露한로 앞에서 제 몸을 식히며 돌아가는 계절이다. “타버린 눈으로 시인은 어차피 자기의 주변을 더듬어 노래해야 한다.”고 하는 &lt;행인의 시학&gt;을 통해 “머물러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떠나며 꽃피우는 일 또한 시인의 본질적인 운명이라”고 역설한 시인의 사유가 깊은 가을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평자들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주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시를 통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탐구에 천착한 시인이라 말하고 있다. 눈이 안탄 시인은 ‘허세’이거나 ‘객기’의 탓이라고 하는 만큼 시인이 직시하는 光源광원을 통해 쓴 &lt;秋日有情추일유정&gt;의 세 번째 시 「송신」을 통해 그 육신의 비의秘儀를 살펴본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후조의 나래깃”으로 「한로」를 노래하고, “돌 속에”서 「가을의 얼굴」을 캐고자 하는 시인은 “귀뚜리”를 통해 “음절을 밟고 지나간” 한로의 바람 앞에서 가을의 전언을 타전하고자 한다.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들을 수 있는 “이내 끝나”는 “귀뚜리의 송신”에 그저 깊어지는 가을 하늘은 “청자의 심연”이 되고 만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인간은 그렇게 문명화되었다. 시인은 마침내 눈이 타버리고 음성만 남는 육성을 「송신」을 통해 하늘도 파랗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을 앞에 인간을 세워두고 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