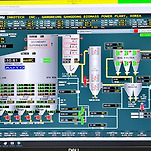<p>1. 홍해 정의 :&#160; <a style="color: #0275d8;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namu.wiki/w/%EC%95%84%EB%9D%BC%EB%B9%84%EC%95%84%20%EB%B0%98%EB%8F%84" target="_top" class="ke-link">아라비아 반도</a><span style="color: #373a3c;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와&#160;</span><a style="color: #0275d8;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namu.wiki/w/%EC%95%84%ED%94%84%EB%A6%AC%EC%B9%B4" target="_top" class="ke-link">아프리카</a><span style="color: #373a3c;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사이에 있는&#160;</span><a style="color: #0275d8;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namu.wiki/w/%EB%B0%94%EB%8B%A4" target="_top" class="ke-link">바다</a><span style="color: #373a3c;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면적은 438,000km² 정도이며 원래는 외해(</span><a style="color: #0275d8;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namu.wiki/w/%EC%9D%B8%EB%8F%84%EC%96%91" target="_top" class="ke-link">인도양</a><span style="color: #373a3c;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으로 통하는 통로는 바브 엘 만데브 해협뿐인&#160;</span><a style="color: #0275d8;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namu.wiki/w/%EB%A7%8C(%EC%A7%80%EB%A6%AC)" target="_top" class="ke-link">만</a><span style="color: #373a3c;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이었지만 사람들이&#160;</span><a style="color: #0275d8;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namu.wiki/w/%EC%A7%80%EC%A4%91%ED%95%B4" target="_top" class="ke-link">지중해</a><span style="color: #373a3c;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로 통하는&#160;</span><a style="color: #0275d8;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namu.wiki/w/%EC%88%98%EC%97%90%EC%A6%88%20%EC%9A%B4%ED%95%98" target="_top" class="ke-link">수에즈 운하</a><span style="color: #373a3c;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를 뚫어서 현대에는 세계적인 항로 중 하나가 됐다. 현대에 들어서는 따뜻한 기후와 수온, 많은 산호초 덕에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집트 쪽 해안이 그러하며&#160;</span><a style="color: #0275d8;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namu.wiki/w/%EC%83%A4%EB%A6%84%EC%97%98%EC%85%B0%EC%9D%B4%ED%81%AC" target="_top" class="ke-link">샤름엘셰이크</a><span style="color: #373a3c;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아인 소카나,&#160;</span><a style="color: #0275d8;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namu.wiki/w/%ED%9B%84%EB%A5%B4%EA%B0%80%EB%8B%A4" target="_top" class="ke-link">후르가다</a><span style="color: #373a3c;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a style="color: #0275d8;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namu.wiki/w/%EC%82%AC%ED%8C%8C%EA%B0%80" target="_top" class="ke-link">사파가</a><span style="color: #373a3c;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a style="color: #0275d8;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namu.wiki/w/%EC%BF%A0%EC%84%B8%EC%9D%B4%EB%A5%B4" target="_top" class="ke-link">쿠세이르</a><span style="color: #373a3c;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마사엘알람 등지가 대표적인 휴양 도시들이다. 특히 후르가다 ~ 마사엘알람의 200여 km 해안에는 수백개의 리조트가 늘어서 있다.</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01039c0dccb205f1f5c4b11eb999303d3ef4cf0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01039c0dccb205f1f5c4b11eb999303d3ef4cf0b" data-origin-width="213" data-origin-height="217"></div><p>한자로 홍해(紅海)<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D%99%8D%ED%95%B4#fn-2" target="_top" class="ke-link">[2]</a>나 영어로 Red Sea라는 뜻 때문에 일부에서는&#160;<b>진짜 붉은색을 띠는 바다</b>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름만 붉은색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D%9D%91%ED%95%B4" target="_top" class="ke-link">흑해</a>&#160;등의 일반적인 바다와 같이&#160;<b>푸른색을 띠는 바다</b>다.<br><br>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다.</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홍해 해안에는 수많은&#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2%B0%ED%98%B8%EC%B4%88" target="_top" class="ke-link">산호초</a>들이 자라고 있는데 보름 때, 물이 밀려 나가면 바닷속 깊이 있던 산호초들이 수면 가까이 자리잡게 되면서 그때 붉은 산호초들로 인해서 바다가 온통 붉게 보이는 데서 홍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p></li><li><p><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95%84%EC%B9%B4%EB%B0%94" target="_top" class="ke-link">아카바</a>&#160;만 동쪽에 아라비아 반도와 페르시아 만까지에 걸쳐서 큰 붉은 산맥들이 바다와 만나는데 이때 붉은 빛이 바다에 비쳐서 붉게 보이는 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도 한다.</p></li><li><p><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D%8A%80%EB%A5%B4%ED%82%A4%EC%98%88" target="_top" class="ke-link">튀르키예</a>의 남쪽에 있어서 홍해가 되었다는 설.&#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D%88%AC%EB%A5%B4%ED%81%AC%EC%9D%B8" target="_top" class="ke-link">투르크인</a>들은&#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B%8F%8C%EA%B6%90" target="_top" class="ke-link">돌궐</a>&#160;시기의 영향으로 동아시아권과 같은&#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98%A4%EB%B0%A9%EC%83%89" target="_top" class="ke-link">오방색</a>의 개념을 사용한다.&#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D%9D%91%ED%95%B4" target="_top" class="ke-link">흑해</a>가&#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D%8A%80%EB%A5%B4%ED%82%A4%EC%98%88" target="_top" class="ke-link">튀르키예</a>의 북쪽에 있으며 이 명칭이&#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98%A4%EC%8A%A4%EB%A7%8C%20%EC%A0%9C%EA%B5%AD" target="_top" class="ke-link">오스만 제국</a>이 들어선&#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15%EC%84%B8%EA%B8%B0" target="_top" class="ke-link">15세기</a>부터 사용되었다는 점, 또&#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D%8A%80%EB%A5%B4%ED%82%A4%EC%98%88%EC%96%B4" target="_top" class="ke-link">튀르키예어</a>로&#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A7%80%EC%A4%91%ED%95%B4" target="_top" class="ke-link">지중해</a>는&#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B%B0%B1%ED%95%B4" target="_top" class="ke-link">백해</a>라고 하는 점<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D%99%8D%ED%95%B4#fn-3" target="_top" class="ke-link">[3]</a>&#160;등이 그 근거로 언급된다.<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D%99%8D%ED%95%B4#fn-4" target="_top" class="ke-link">[4]</a>&#160;오스만 제국은 최대 강역이&#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95%84%ED%94%84%EB%A6%AC%EC%B9%B4%EC%9D%98%20%EB%BF%94" target="_top" class="ke-link">아프리카의 뿔</a>, 즉&#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6%8C%EB%A7%90%EB%A6%AC%EC%95%84" target="_top" class="ke-link">소말리아</a>&#160;북부와&#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A7%80%EB%B6%80%ED%8B%B0" target="_top" class="ke-link">지부티</a>,&#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8%98%EB%8B%A8%20%EA%B3%B5%ED%99%94%EA%B5%AD" target="_top" class="ke-link">수단</a>&#160;동부 등에 이르렀고 심한 더위와 전염병 때문에 철수했지만 한때는&#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8%98%EB%8B%A8%20%EA%B3%B5%ED%99%94%EA%B5%AD" target="_top" class="ke-link">수단 공화국</a>의&#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B%8B%A4%EB%A5%B4%ED%91%B8%EB%A5%B4" target="_top" class="ke-link">다르푸르</a>와 코르도판,&#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B%82%A8%EC%88%98%EB%8B%A8" target="_top" class="ke-link">남수단</a>의&#160;<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A3%BC%EB%B0%94" target="_top" class="ke-link">주바</a>&#160;일대에도 갔던 적이 있다.</p></li></ul><p>2. 홍해의 염도</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72e2854cbcd2a527b237ce051529155bef0f429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72e2854cbcd2a527b237ce051529155bef0f4291" data-origin-width="667" data-origin-height="314"></div><p><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8">홍해는</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인도양의</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지류로서</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아프리카와</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아시아</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사이에</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위치해</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있다</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홍해는</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염도가</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매우</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높은데</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36-41%),&#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이는</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높은</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증발률과</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극도로</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적은</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강우량</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그리고</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이</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바다로</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흘러들어오는</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강물이나</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지류가</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매우</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적은</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데</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기인한다</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산호분포지역</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중</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가장</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북쪽에</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위치함에도</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불구하고</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에일랏만</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아카바만</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북부의</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원시</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어초는</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산호의</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다양성이</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세계에서</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가장</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높은</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지역</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중</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하나이다</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이</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곳에는</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천여종이</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넘는</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무척추생물들과</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이백여</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종의</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경산호와</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연산호가</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서식하고</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있다</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일관된</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일조</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日照</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와</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백사장</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천연의</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산호초와</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곳곳에</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흩어져</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있는</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난파선들은</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이</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곳을</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스쿠버다이버</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스노클러</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선탠을</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즐기는</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사람들의</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메카로</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만들고</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404040;" data-ke-size="size16">있다</span><span style="color: #40404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span data-ke-size="size18">길이 약 2,300km. 남부 너비 약 360km. 북부 너비 약 200km. 면적 약 44만㎢. 부피 22만㎦. 최대수심 2,213m. 인도양과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지중해와는 수에즈 운하로 이어진다. 투명도 약 30m로서 여러 빛깔의 열대어의 유영이 잘 보인다. 바닷속에 있는 해조 때문에 물빛이 붉은빛을 띠는 일이 있으므로 ‘홍해’라고 불린다. 동(東)아프리카 대지구대(大地溝帶)의 일부이며 두 개의 대단층(大斷層)으로 이루어진 요지(凹地)에 물이 괴어 형성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건조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해수의 증발도가 대단히 높으며, 와디(乾川: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강) 외에는 항상 유입하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염분이 많다. 표면 염분은 평균 37∼41‰로, 페르시아만(灣)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바다로 알려졌다. 홍해의 염분과 수온(여름철에는 표면 30℃, 겨울철에는 20℃)은 균질하다고 오랫동안 믿어 왔으나 1948년 스웨덴의 관측선에 의하여, 북위 21°, 동경 38° 부근의 해저에 고온이며 염분이 많은 함수괴(鹹水塊)가 있음이 발견되었다</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76ee804a63b700d0bd1a0ddd1a901cab7ed9b65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76ee804a63b700d0bd1a0ddd1a901cab7ed9b651" data-origin-width="681" data-origin-height="453"></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cf0aaef04b5d1b4f4dfb1c96d349cd5efb4663f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cf0aaef04b5d1b4f4dfb1c96d349cd5efb4663f6" data-origin-width="351" data-origin-height="501"></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db44e63f20290325a7e799fc61815e4a6fc3641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db44e63f20290325a7e799fc61815e4a6fc36415" data-origin-width="300" data-origin-height="145"></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5b387f88968c05233504536aa90f678aa955f98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5b387f88968c05233504536aa90f678aa955f98d" data-origin-width="455" data-origin-height="905"></div><p>&#160;</p><p><span style="color: #121212;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20">年 1m씩 수위 낮아져… 홍해 연결 운하 추진</span></p><p style="text-align: start;"><b>이스라엘 대표기업 공동투자 166km 프로젝트 본격화</b></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b>“물부족 해소-100만 일자리 창출” 주변국 환영 한목소리</b></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죽어가는 사해(死海)를 살리기 위한 ‘운하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염분이 많아 사람이 누우면 둥둥 뜨는 것으로 유명한 이 소금 호수를 살리는 대공사가 성공할 경우 이스라엘-아랍 간 평화의 상징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p><p style="text-align: start;">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사해의 수위는 해마다 1m씩 낮아지고 있다. 사해로 흘러들어가야 할 요르단 강 물의 70∼90%를 주변국들이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써버리기 때문이다. 러시아 노보스티통신은 “이대로 가면 50년 뒤에는 사해가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라고 예측했다.</p><p style="text-align: start;">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평화협정을 맺은 뒤 홍해의 물을 사해로 끌어들일 운하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50억 달러(약 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건설 공사비를 조달할 방법을 찾지 못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p><p style="text-align: start;">○ 20만 명 수용 호텔-세계 최대 식물원도 건설</p><p style="text-align: start;">이스라엘 일간지 예루살렘포스트는 부동산 재벌인 이츠하크 트슈바 엘라드그룹 회장, 샤리 아리손 하포앨림은행 회장, 세계적 공구업체인 이스카의 스테프 웨르테이메르 창업자 등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이 사해와 홍해를 잇는 166km의 운하 건설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최근 보도했다.</p><p style="text-align: start;">트슈바 회장은 사해 주변에 총 20만 명이 투숙할 수 있는 호텔들과 세계 최대의 식물원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신문은 “운하 건설에 결정적인 지원군을 얻었다”라고 평가했다.</p><p style="text-align: start;">요르단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일간지 요르단타임스는 “25일부터 정부와 세계은행 관계자, 영국 프랑스의 기업인들이 운하 건설의 타당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건설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p><p style="text-align: start;">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르면 2년 안에 운하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인터넷판이 28일 전했다.</p><p style="text-align: start;">○ 연간 10억 ㎥ 생활용수 주변국에 공급</p><p style="text-align: start;">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환경단체들은 홍해의 물이 사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운하 건설이 사해를 살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아랍 관계에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설명했다.</p><p style="text-align: start;">운하 건설은 지역 현안인 물 부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주변국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p style="text-align: start;">운하로 흘러가는 바닷물의 일부를 담수화하면 연간 10억 m³의 생활용수를 이스라엘과 요르단, 팔레스타인에 공급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물 부족의 30%를 해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비즈니스위크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운하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또 운하 건설 및 주변 관광 시설의 공사가 본격화되면 100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관광객이 늘어나 주변국들의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루살렘포스트는 분석했다.</p><p style="text-align: start;">&#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362579c85344f135047e1d5992afc771d0b6b19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5x/362579c85344f135047e1d5992afc771d0b6b19d" data-origin-width="617" data-origin-height="403"></div><p>3. 바다의 이름</p><p><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바다가 있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이름하여 사해(死海).</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작은 바다로 표층수에 ℓ당 227~275g의 소금이 들어 있고 수심 100m 이하 층의 물에는 ℓ당 327g의 소금이 들어 있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사해에서는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다.따라서 사해에 물고기를 방류하면 즉시 죽기 때문에 사해라는 이름이 생겼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이와 같이 사해의 염분 농도가 높은 이유는 사해로 흘러들어오는 요르단 강의 바닥에 암염이 있어서 매일 상당량의 소금이 녹아 들어오기 때문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이같은 바다 특성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바다는 사해외에도 흑해(黑海)와 홍해(紅海)를 들 수 있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흑해는 최고 수심이 2천104m로 수심 200m 이하의 해저에는 다량의 유화수소가 있어서 하늘에서 바라보면 바다의 색이 검게 보여 흑해라고 부르게 되었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캐비어의 원료가 되는 철갑상어의 주요어장으로 유명한 흑해는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남쪽으로는 터키로 둘러싸여 있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서쪽에 있는 지중해와는 수심 40m의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연결돼 있지만 보스포루스 해협의 수심이 얕기 때문에 수심 40m 이하의 흑해의 바닷물은 순환되지 않는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홍해는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길이 2천300㎞,폭 270㎞,최고 수심 2천221m,총면적 44만㎢의 바다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해저에는 산호 파편을 비롯한 석회질의 뻘이 많으며 탄산석회 함량이 92%에 달한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트리코스미움이라는 남조류가 대량 발생하면 바다의 색이 빨간색 혹은 주홍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홍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7f7f7;" data-ke-size="size20">과거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차를 수입할 때 홍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차의 색이 붉게 변해 홍차라고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김 진기자</span></p>
<!-- -->
카페 게시글
우주.해양
홍해(Red Sea)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