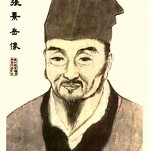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07.&#160;의안(按)을 부(附)하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span data-ke-size="size18">설씨(薛氏)가 어떤 남자(男子)를 치료(治)하였으니, 평소&#160;<span style="color: #0000ff;">각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脚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있어 협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脇下</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작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作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발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發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며 두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頭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구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嘔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며 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痺</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불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仁</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였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소독음(消毒飮) 호심산(護心散) 등의 약(藥)을 복용하였으나 응(應)하지 않았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00ff;">좌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左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의 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緊</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우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右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의 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弦</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므로, 이는 역시&#160;<span style="color: #ff0000;">각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脚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었다.&#160;<span style="color: #00cc00;">반하좌경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半夏左經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치료(治)하였더니 나았느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어떤 남자(男子)가&#160;<span style="color: #0000ff;">각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脚軟</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종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腫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발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發熱</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음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飮冷</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며 대소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大小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우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右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의 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삭</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였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는 곧&#160;<span style="color: #0000ff;">족양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足陽明</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의 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經</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습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濕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유주</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流注</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한 것이었다.&#160;<span style="color: #00cc00;">대황좌경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大黃左經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치료(治)하였더니 나았느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어떤 부인(婦人)이&#160;<span style="color: #0000ff;">지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肢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종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腫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한데 경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脛足</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더 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였으며 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時</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로 혹 자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自汗</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 두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頭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였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는&#160;<span style="color: #0000ff;">태양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太陽經</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의 습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濕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의 소치(所致)이다.&#160;<span style="color: #00cc00;">마황좌경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麻黃左經湯</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2제(劑)를 썼더니 나았느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어떤 남자(男子)가&#160;<span style="color: #0000ff;">양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兩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종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腫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서 삭</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였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는&#160;<span style="color: #0000ff;">습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濕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의 소치(所致)이었다. 먼저&#160;<span style="color: #00cc00;">오령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五&#33491;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에 창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蒼朮</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황백</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黃栢</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가한 것 2제(劑)를 썼더니 조금 나았느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다시&#160;<span style="color: #00cc00;">이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二陳</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반하 진피</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이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二朮</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창출 백출</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빈랑</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檳&#27028;</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자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紫蘇</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강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羌活</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독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獨活</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우슬</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牛膝</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황백</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黃栢</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하였더니 다 나았느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습담(濕痰)의 증(證)은 반드시 먼저&#160;<span style="color: #00cc00;">행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行氣</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이습</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利濕</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건중</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健中</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위주로 하여야 하니, 중기(中氣)가 화(和)하면 담(痰)이 저절로 소(消)하면서 습(濕)도 용납(:容)할 곳이 없게 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어떤 남자(男子)가&#160;<span style="color: #0000ff;">우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右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적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赤腫</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흔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28974;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며 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침삭</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沈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였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cc00;">당귀염통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當歸拈痛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썼더니 사지(四肢)가 도리어 통(痛)하였다. 이는&#160;<span style="color: #f200f2;">습독</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濕毒</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옹알</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壅&#36943;</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160;막다)한 것이고, 더구나 하부(下部)에 약(藥)이 쉽게 도달(達)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니, 약(藥)이 증(證)과 대(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에 환처(患處)에 폄(&#30765;)하여&#160;<span style="color: #00cc00;">독혈</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毒血</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을 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去</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고 다시 앞의 약(藥)을 썼더니, 1제(劑)에 갑자기 감(感)하고 4제(劑)를 더 썼더니 소(消)하였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어떤 부인(婦人)이&#160;<span style="color: #0000ff;">각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脚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를 앓아 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時</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로 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腫</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근련</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筋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며 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腹</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작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作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였고 제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諸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지 않아 점차 위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危篤</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에 이르렀느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여러 서(書)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00cc00;">팔미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八味丸</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은 족소음(足少陰)의 각기(脚氣)가 복(腹)에 들어가 동통(疼痛)하고 상기(上氣) 천촉(喘促)하여 욕사(欲死)하는 것을 치(治)한다.&quot; 하였다. 이를 투여(投)하니 1번 복용하였더니 갑자기 퇴(退)하였고 또 복용하였더니 다 나았느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신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腎經</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허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寒</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 사람들에게 이 질환(:患)이 많이 있는데, 곧&#160;<span style="color: #f200f2;">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心</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을 승</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乘</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160;<span style="color: #f200f2;">수극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水剋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증(證)이다. 조금만 완(緩)하였으면 사(死)하여 발길을 되돌릴 수 없었으니(:旋踵) 마땅히 급히 이를 복용하여야 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어떤 부인(婦人)이&#160;<span style="color: #0000ff;">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굴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屈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지 못하고 풍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風寒</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만나면 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더욱 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게 되며 제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諸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지 않아 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히 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苦</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였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먼저&#160;<span style="color: #00cc00;">활락단</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活絡丹</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1환(丸)을 사용하였더니 갑자기 퇴(退)하고 또 복용하였더니 다 나았느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다음 해에 다시 통(痛)하길래 이에 1환(丸)을 복용하게 하였더니 또 대반(大半: 2/3 이상)이 퇴(退)하였고 다시&#160;<span style="color: #00cc00;">독활기생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獨活寄生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4제(劑)를 복용하였더니 다 나았느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어떤 남자(男子)가 평소&#160;<span style="color: #0000ff;">각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脚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있었고 또 부골옹</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附骨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앓아 작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作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였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cc00;">활락단</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活絡丹</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1환(丸)을 복용하였더니 두 가지 증(證)이 모두 다 나았느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상사(上舍: 생원) 유노월(兪魯月)이 평소에&#160;<span style="color: #0000ff;">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있어 낫지 않고 있다가 이로 인하여 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의 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을 앓게 되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cc00;">활락단</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活絡丹</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1환(丸)을 썼더니, 퇴(腿)의 질환(:患)에 유효(有效)할 뿐만 아니라 산(疝)도 같이 나았느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유도(留都: 남경)의 김이수(金二守)의 딸이&#160;<span style="color: #0000ff;">경풍</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驚風</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을 앓아 심(甚)히 위(危)하였는데 제의(諸醫)가 모두 구(救)하지 못하였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스스로&#160;<span style="color: #00cc00;">활락단</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活絡丹</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1환(丸)을 썼더니 바로 나았고, 다시 작(作)하지도 않았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병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病邪</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內</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심복</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深伏</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이 약(藥: 활락단)이 아니면 통달(通達)할 수 없다. 단지 근대(近代)에 &#39;이 약(藥)은 풍(風)을 인(引)하여 골(骨)에 들어가게 하니, 마치 유국(油麵)과 같다.&#39; 라는 설(說)이 있었으므로 후인(後人)들이 대부분 이를 복용하기를 꺼려하였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대체로 이 병(病)에는 마땅히 이 약(藥)을 써야 하니, 어찌 그 말에 구애(:泥)되어 병(病)이 낫기 어렵게 만들 수 있겠는가?</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