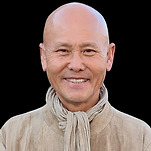<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rvdcivdygcu28tfvajc6enjod@my?service=daum_cafe" data-video-host="kakaotv"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712" data-video-height="40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thumb.kakaocdn.net/dna/kamp/source/rvdcivdygcu28tfvajc6enjod/thumbs/5.jpg?credential=TuMuFGKUIcirOSjFzOpncbomGFEIdZWK&amp;expires=33280935403&amp;signature=Mql%2BVB6s93C%2BF6VeO9FyW645QAI%3D" data-ke-mobile-mobileStyle="widthFull" data-video-origin-width="712" data-video-origin-height="400"><iframe src="https://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rvdcivdygcu28tfvajc6enjod@my?service=daum_cafe&amp;ptoken=v2_7d4c044ef3cc86dd71b7158944bd6abe5a918e9cea4b550759df70107ee887618496550c9dbe8c849cf8ad58e29538fdd3ccab262bde0b269f2920e802" width="712" height="40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 allow="encrypted-media"></iframe><div class="figcaption">인도가사 착의법 2023. 12. 07. 보드가야</div></div><p>&#160;</p><p><span data-ke-size="size20"><span data-ke-size="size26">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 중권</span></span></p><p><span data-ke-size="size20">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 卷中</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비사거 모음</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尊者毘舍&#20297;造</span></p><p><span data-ke-size="size20">의정 한역</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三藏法師義淨(635~713)奉 制譯</span></p><p>&#160;</p><p><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가사는 범어</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k&#257;s&#257;ya)</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로서</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나무 껍질이나</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꽃 잎 등으로 </span></p><p><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160; &#160; 염색한 것을 의미하며, 열 가지의 누더기 <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분소의</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糞掃衣</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를 말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6. </span><span data-ke-size="size20">아흔 가지 바일저가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波逸底迦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九十波逸底迦法</span></p><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20">58) </span><span data-ke-size="size20">착불괴색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着不壞色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학처</span></p><p><span data-ke-size="size20">著不壞色衣學處</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필추(비구)가 새 옷을 얻게 되면</span></p><p><span data-ke-size="size20">곧 괴색</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壞色</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으로 하여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새 옷이란 흰 색을 말하며</span></p><p><span data-ke-size="size20">괴색으로 물들임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苾芻得新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當須爲壞色</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新衣謂是白</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染壞色有三</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푸른색은 더러운 빛으로 푸른 것이고</span></p><p><span data-ke-size="size20">흙빛이란 붉은 돌 색을 말하며</span></p><p><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나무 껍질이나 꽃잎으로 물들인 것을</span></p><p><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가사</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袈裟</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범어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k&#257;s&#257;ya)</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라 부른다</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靑謂&#27745;色靑</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泥者謂赤石</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樹皮花葉等</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染色號袈裟</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ebda4db1580dbe0f37d59985719aa8f3c447250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ebda4db1580dbe0f37d59985719aa8f3c4472509" data-origin-width="1196" data-origin-height="709"></div><p>&#160;</p><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26">대반야바라밀다경 제</span><span data-ke-size="size26">544</span><span data-ke-size="size26">권</span></p><p><span data-ke-size="size20">大般若波羅蜜多經卷第五百四十四</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삼장법사 현장 한역</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三藏法師玄&#22872;(602~664) 奉詔譯</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6. </span><span data-ke-size="size20">수희회향품</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隨喜廻向品</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②</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第四分隨喜&#36852;向品第六之二</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중략</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사리자야</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나는 이와 같은 매우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바른 법을 비방한 이에게는 그 이름조차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하거늘</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하물며 그에게 말해 주겠느냐</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舍利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我於如是甚深般若波羅蜜多</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23578;不欲令謗正法者聞其名字</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況爲彼說</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사리자야</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바른 법을 비방한 이면 나는 보살승에 머무른 선남자들이 그의 이름조차 듣는 것도 허락 못하겠거늘</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하물며 눈으로 보거나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겠느냐</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舍利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謗正法者</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我&#23578;不聽住菩薩乘善男子等聞其名字</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況當眼見</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豈許共住</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사리자야</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바른 법을 비방한 이면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나는 </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가사</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袈裟</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범어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k&#257;s&#257;ya)</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를 입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거늘</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 <span data-ke-size="size20">하물며 공양을 받는 것이겠느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舍利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謗正法者</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我&#23578;不聽被服</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袈裟</span></u><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況受供養</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왜냐 하면 사리자야</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매우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비방하는 모든 이들은 그들의 이름이 바른 법을 무너뜨리는 이라 어두운 무리에 떨어짐은 마치 더러운 달팽이와 같고 스스로를 더럽히면서 남도 더럽힘은 마치 똥 무더기와 같기 때문이니</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법을 무너뜨리는 이의 말을 신용하는 모든 이들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큰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何以故</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舍利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諸有&#27584;謗甚深般若波羅蜜多</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當知彼名壞正法者</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墮黑闇類如穢蝸螺</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自&#27745;&#27745;他如爛糞聚</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諸有信用壞法者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亦受如前所說大苦</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95b00bc5c7dec18d134ce7cf4e2a1c95bf0a6a5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95b00bc5c7dec18d134ce7cf4e2a1c95bf0a6a5e" data-origin-width="1126" data-origin-height="698"></div><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26">대방광삼계경 중권</span></p><p><span data-ke-size="size20">大方廣三戒經卷中</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북량 천축삼장 담무참 한역</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北&#28092;天竺三藏曇無讖(385~433)譯</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와 같이 차츰 많은 여자들은 그 남편을 버리고 승방</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僧坊</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에 가서 논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승방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한 여자를 위해 설법하여 해탈하는 법을 가르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러나 가섭아</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나는 그 때에 그것은 순전한 비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非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으로서 </span><span data-ke-size="size20">5</span><span data-ke-size="size20">백의 비법의 문이요</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5</span><span data-ke-size="size20">백의 번뇌의 문임을 본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때에는 다 계율이 없어 재가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在家者</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와 다름이 없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如是漸漸多有女人</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棄捨其夫遊諸僧坊</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入僧坊已</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爲一女人而獨說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示解脫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迦葉</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我見爾時純是非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五百非法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五百煩惱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不修行人</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當于爾時</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悉是無戒</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在家無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가섭아</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 때에는 계법이 극히 악해 이익만을 바란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이는 마땅히 비구니를 친근하지 말고 그곳에 머물지 말며</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친근하지 않는 것도 떠나고 다시 친근하지도 말아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세간의 이양</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利養</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을 버리고 걸식행</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乞食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을 의지하며</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고운 옷을 버리고 </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분소의</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糞掃衣</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를 입으며</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 data-ke-size="size20">&#160;</span><span data-ke-size="size20">迦葉</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當于爾時</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戒法極惡</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若希望利益</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求菩提者</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不應親近於比丘尼</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不住是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離不親近</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更勿親近</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捨世利養</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依乞食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捨愛衣服</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受</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糞掃衣</span></u><span data-ke-size="size20">,</span>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누각과 침대와 침구를 버리고 산림과 굴속과 토굴을 의지하며</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모든 맛난 약을 버리고 오래되고 버린 약을 의지하라</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모든 중생에 대해 친애하는 생각을 내고 인자한 마음을 수행하여 일체의 비방과 구타를 참아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일체의 아는 이와 친족을 버리고 업을 닦아 스스로 살아가면서 저 재가자와 어울려 해탈계</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解脫戒</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를 말하지 말되 그 행을 수순해야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捨離臺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牀臥敷具</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依止山林</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坑&#15694;</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窟舍</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捨離一切甘美病藥</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依陳棄藥</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於諸衆生生親愛想</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修行慈心</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當忍一切&#27584;罵&#25790;打</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捨離一切知識親族</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修業自活</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不應同彼在家之人</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說解脫戒</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當隨順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474f17889754201016e13603ee6daae03bd95a4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474f17889754201016e13603ee6daae03bd95a4e" data-origin-width="1138" data-origin-height="653"></div><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23">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제</span><span data-ke-size="size23">5</span><span data-ke-size="size23">권</span></p><p><span data-ke-size="size20">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五</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반랄밀제 한역</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唐天竺沙門般剌蜜諦 譯(705)</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중략</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대목건련</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大目&#29325;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大目&#25589;連卽從座起</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頂禮佛足而白佛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저는 거리에서 걸식을 하다가 우루빈라</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優樓頻螺</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가야</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伽耶</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나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那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의 세 가섭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迦葉波</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를 만나서</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들이 선양하는 여래 인연법의 깊은 뜻을 듣고 단번에 발심하여 크게 통달하자</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여래께서는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제 몸에 저절로 </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가사</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袈裟</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가 입혀지고</span> <span data-ke-size="size20">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我初於路乞食逢遇優樓頻螺</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伽耶</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那提三迦葉波</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宣說如來因緣深義</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我頓發心得大通達</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如來惠</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我</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袈裟</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著身</span><span data-ke-size="size20">鬚髮自落</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또 제가 시방을 다니면서 걸림 없는 경지에 들어 신통</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神通</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을 밝히자</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여래로부터 </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더없이 훌륭한 신통</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라는 추천을 받고</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저는 아라한을 성취하였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어찌 세존뿐이겠습니까</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시방의 여래께서도 저의 신통력을 </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원만하게 밝고 청정하고 자재하여 두려움이 없는 경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라고 찬탄하셨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我遊十方得無&#32611;&#14197;</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神通發明推爲無上</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成阿羅漢</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寧唯世尊</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十方如來歎我神力</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圓明淸淨自在無畏</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 법을 물으시니</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제 경우로는 고요한 자리를 돌이켜서 마음의 빛을 탁한 물을 오래 두어 맑히듯 밝히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佛問圓通</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我以旋湛心光發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如澄濁流久成淸瑩斯爲第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b98298436cbafb3fe52721c927394d4b64ddfcf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b98298436cbafb3fe52721c927394d4b64ddfcff" data-origin-width="1091" data-origin-height="689"></div><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26">대승입능가경 제</span><span data-ke-size="size26">6</span><span data-ke-size="size26">권</span></p><p><span data-ke-size="size20">大乘入楞伽經卷第六</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대주 우전국 실차난타 한역</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大周于&#38352;國 三藏法師 實叉難&#38465; 奉勅譯(70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7. </span><span data-ke-size="size20">변화품</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變化品</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變化品第七</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중략</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항상 푸른 등의 색과</span></p><p><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쇠똥ㆍ진흙 과일 잎으로</span></p><p><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흰 감바라</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欽婆</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옷의 일종</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를 염색하여</span></p><p><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가사</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袈裟</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의 색</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을 만들어라</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常以靑等色</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牛糞泥果葉</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染白欽婆等</span><span data-ke-size="size20">,</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令作袈裟色</span></u><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손가락 네 개 길이</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四指量</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정도의 칼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칼은 반달 모양인 것으로</span></p><p><span data-ke-size="size20">옷을 재단하는 데 쓰기 위해</span></p><p><span data-ke-size="size20">수행자가 간직함을 허락하노라</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四指量刀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刀如半月形</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爲以割截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修行者聽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그때 난타와 우바난타가 가늘고 성긴 옷을 입었기에 맨 몸이 드러나 보이며</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또한 육군비구들이 때 묻고 더럽고 떨어진 옷을 입었기에 허리와 갈빗대와 등과 팔꿈치가 드러난 채 함께 단월의 집에 들어갔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들이 비웃으며 말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보시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사문 석자들은 마치 왕이나 대신들처럼 가늘고 성긴 옷을 입어서 형체가 드러나 보이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 data-ke-size="size20">佛住舍衛城</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廣說如上</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爾時難&#38465;</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優婆難&#38465;</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著細生疏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形體露現</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又復六群比丘著垢&#33193;破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腰脅背&#32920;露現</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共入檀越家</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爲世人所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看沙門釋子如王</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大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著細生疏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形體露現</span><span data-ke-size="size20">。</span>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그리고 떨어진 헌 옷을 입은 자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보시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사문 석자들은 이러한 의복을 입어서 맨 몸이 드러나 보이기가 마치 노복</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奴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과 같고 나그네 같고 천한 사람같이 하여 단월의 집에 들어왔으니</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이렇게 이치에 벗어난 사람에게 무슨 도가 있으리요</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 data-ke-size="size20">見著弊衣者作是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看沙門釋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著如是衣服</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形體露現</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似如奴僕客作賤人入家內</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此壞敗人</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爲有何道</span><span data-ke-size="size20">?</span>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여러 비구들이 이를 듣고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육군비구들을 불러오너라</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그들이 오자</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물으셨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비구들아</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대들이 실제로 그리하였느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사실입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諸比丘聞已</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以是因緣往白世尊</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佛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呼六群比丘來</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來已</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佛問比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汝實爾不</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答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實爾</span><span data-ke-size="size20">。</span>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오늘부터는 마땅히 몸을 잘 덮고 단월의 집에 들어가야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열 가지 이로움을 위하여 비구들의 계율을 제정할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러므로 이미 들었던 자들도 다시 들어라</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몸을 잘 감싸고 단월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마땅히 배워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佛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從今日後當好覆身入家內</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佛告諸比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依止舍衛城住者皆悉令集</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以十利故與諸比丘制戒</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乃至已聞者當重聞</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好覆身入家內</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應當學</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만일 안타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安陀會</span><span data-ke-size="size20">;</span> <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산스크리트어로 </span><span data-ke-size="size18">Antarv&#257;sa, antarv&#257;saka</span><span data-ke-size="size18">이며 팔리어로는 </span><span data-ke-size="size18">Antarav&#257;saka</span><span data-ke-size="size18">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수행자에게 허용된 삼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三衣</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중 하나로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오조의</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五條衣</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5</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조 가사</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라 하며 내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內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말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를 지을 적에는 마땅히 촘촘한 천으로 지어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 data-ke-size="size20">若作安&#38465;會</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當用緻物作</span>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만일 천이 성글 때에는 마땅히 두 겹이나 세 겹으로 지어야 하며</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만일 안타회가 성글 적에는 울다라승</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27421;多羅僧</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산스크리트어로 </span><span data-ke-size="size18">Uttar&#257;sa&#7749;ga</span><span data-ke-size="size18">이며 팔리어로는 </span><span data-ke-size="size18">Uuttar&#257;sa&#7749;ga</span><span data-ke-size="size18">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수행자에게 허용된 삼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三衣</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중 하나로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칠조가사</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七條袈裟</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span> <span data-ke-size="size18">혹은 칠조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七條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라 하며 상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上衣</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혹은 상착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上著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말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은 마땅히 촘촘한 천으로 지어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 data-ke-size="size20">若疏者</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當兩重三重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若安&#38465;會疏者</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鬱多羅僧當用緻物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만일 울다라승이 성글 적에는 승가리</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僧伽梨</span><span data-ke-size="size20">;</span> <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산스크리트어로 </span><span data-ke-size="size18">Sa&#7747;gh&#257;&#7789;&#299;</span><span data-ke-size="size18">이며 팔리어로는 </span><span data-ke-size="size18">Sa&#7749;gh&#257;&#7789;&#299;</span><span data-ke-size="size18">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승려의 의복으로 가사</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袈裟</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복액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覆腋衣</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엄액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掩腋衣</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법복</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法服</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중복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重複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로 불리며 가장 바깥에 입는 의식을 행하고 위의를 갖출 때 입는 승복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는 마땅히 촘촘한 천으로 지어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若鬱多羅僧疏者</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僧伽梨當用緻物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만일 여러 근</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根</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을 제멋대로 하여 몸을 좋게 감싸지 않고서 단월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학인의 법도를 위반하는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 data-ke-size="size20">若放恣諸根不好覆身入家內者</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越學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그러나 미치거나 어리석거나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죄가 없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런 까닭에 말하는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몸을 잘 감싸고 단월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마땅히 배워야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若狂</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癡</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心亂無罪</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是故說</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好覆身入家內</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應當學</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7212b4c25319b84d8028cc750ede5290222a902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7212b4c25319b84d8028cc750ede5290222a902e" data-origin-width="1129" data-origin-height="647"></div><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26">사분율 제</span><span data-ke-size="size26">60</span><span data-ke-size="size26">권</span></p><p><span data-ke-size="size20">四分律 卷第六十 第四分之十一</span></p><p><span data-ke-size="size20">요진 계빈삼장 불타야사ㆍ축불념 등 공역</span></p><p><span data-ke-size="size20">姚秦&#32637;賓三藏佛&#38465;耶舍共竺佛念等 譯(384~417)</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37. </span><span data-ke-size="size20">계율의 늘어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毘尼增一</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④</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열 가지 옷이 있으니</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구사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拘奢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ㆍ겁패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劫貝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ㆍ흠발라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欽跋羅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ㆍ추마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芻摩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ㆍ차마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叉摩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ㆍ사누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舍&#14201;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ㆍ마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麻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ㆍ시이라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翅夷羅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ㆍ구차라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拘遮羅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ㆍ차라파니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差羅波尼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니</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물을 들여 </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가사 빛</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袈裟色</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으로 만들라</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 <span data-ke-size="size18">有十種衣。拘奢衣、劫貝衣、欽跋羅衣、芻摩衣、叉摩衣、舍&#14201;衣、麻衣、翅夷羅衣、拘遮羅衣、差羅波尼衣。是十種衣<span style="color: #0000ff;">應染作</span><u><span style="color: #0000ff;">袈裟色</span></u><span style="color: #0000ff;">衣持</span>。</span></p><p>&#160;</p><p><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열 가지 종류의 누더기 옷</span><u><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span></u><u><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糞掃衣</span></u><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이 있으니</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span>&#160; &#160;<span data-ke-size="size20">소가 씹은 옷ㆍ쥐가 쏠은 옷ㆍ태운 옷ㆍ월경이 묻은 옷ㆍ산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産婦</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의 옷ㆍ사당에 버린 옷ㆍ무덤 사이의 옷ㆍ원한 옷</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願衣</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소원을 이루기 위해 입기를 바라고 주는 옷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20">ㆍ왕을 세울 때의 옷</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立王衣</span><span data-ke-size="size18">; &lt;</span><span data-ke-size="size18">왕직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王職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라고도 하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왕직의는 관료가 왕의 명으로 보직이 바뀔 때 발생하는 쓸모없게 된 옷이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런데 사분율 권</span><span data-ke-size="size18">39</span><span data-ke-size="size18">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왕족들 간에 싸울 때 죽은 시체의 옷</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취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으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즉</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왕을 세우거나 왕직을 걸고 싸울 때 발생하는 분소의가 입왕의 혹은 왕직의가 아닌가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20">ㆍ갔다온 옷</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往還衣</span><span data-ke-size="size18">; &lt;</span><span data-ke-size="size18">갔다 온 옷이라는 것은</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체를 덮어 무덤까지 갔다가 다시 가져온 옷을 말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18">有十種</span><u><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糞掃衣</span></u><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牛嚼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鼠&#22169;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燒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月水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初&#29986;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神廟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塚閒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願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立王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往還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是爲十</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ef56086804cf9ed486930599b681ef8ab0674f3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ef56086804cf9ed486930599b681ef8ab0674f39" data-origin-width="990" data-origin-height="592"></div><p>&#160;</p><p><span data-ke-size="size26">증일아함경 제</span><span data-ke-size="size26">15</span><span data-ke-size="size26">권</span></p><p><span data-ke-size="size20">增壹阿含經卷第十五</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동진 계빈 삼장 구담 승가제바 한역</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東晉&#32637;賓三藏瞿曇僧伽提婆 譯(343~397)</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24. </span><span data-ke-size="size20">고당품</span><span data-ke-size="size20">②</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高幢品第二十四之二</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중략</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이때 진정왕은 이 말을 듣고 곧 기쁜 마음을 품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우다야에게 말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어떠냐</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우다야여</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실달 태자는 지금도 그대로 계시느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是時</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眞淨王聞此語已</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便懷歡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不能自勝</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語優&#38465;耶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云何優&#38465;耶</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悉達太子今故在耶</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우다야가 대답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석가모니부처님은 현재 살아 계십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優&#38465;耶報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釋迦文佛今日現在</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그때 왕이 물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제 부처가 되었느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時</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王問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今已成佛耶</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우다야가 대답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제는 벌써 부처가 되었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優&#38465;耶報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今已成佛</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왕이 또 물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지금 여래는 어디 계시느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王復問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今日如來竟爲所在</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우다야가 대답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여래는 지금 마갈국</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摩竭國</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경계 안에 있는 니구류 나무 밑에 계십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優&#38465;耶報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如來今在摩竭國界尼拘類樹下</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時</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王報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翼從弟子斯是何人</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우다야가 대답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수억의 여러 하늘들과 </span><span data-ke-size="size20">1</span><span data-ke-size="size20">천 비구들과 사천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四天王</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들이 항상 그의 곁에 있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優&#38465;耶報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諸天億數及千比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四天王恒在左右</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그때 왕이 물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그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이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時王問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所著衣服</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爲像何類</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우다야가 대답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여래께서 입으신 옷은 </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가사</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袈裟</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라고 부릅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優&#38465;耶報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如來所著衣裳</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名曰</span><u><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袈裟</span></u><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그러자 왕이 물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어떤 음식을 드시느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時</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王問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食何等食</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우다야가 대답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여래의 몸은 법을 음식으로 삼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優&#38465;耶報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如來身者以法爲食</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왕이 다시 물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어떠냐</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우다야여</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여래를 뵈올 수 있겠느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王復問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云何優&#38465;耶</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如來可得見不</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우다야가 대답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왕은 시름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십시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이레 뒤에는 여래께서 이 성</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城</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優&#38465;耶報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王</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勿愁&#24722;</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21371;後七日</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如來當來入城</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그때 왕은 매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손수 음식을 주어 우다이를 공양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是時</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王極歡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不能自勝</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手自斟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供養優&#38465;耶</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223fee58b29152e286531c6694b2d638cdeee89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223fee58b29152e286531c6694b2d638cdeee898" data-origin-width="1109" data-origin-height="625"></div><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26">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제</span><span data-ke-size="size26">10</span><span data-ke-size="size26">권</span></p><p><span data-ke-size="size20">根本說一切有部百一&#32687;磨 卷第十</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당나라 의정 한역</span></p><p><span data-ke-size="size20">三藏法師義淨奉 <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20">(635~713)</span> 制譯</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대덕이시여</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필추는 마땅히 열세 가지 생활의 기본이 되는 용구와 옷을 갖추어 비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마땅히 어떻게 비축하여야 합니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마땅히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서 간직하여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무엇을 열세 가지 생활 용구와 옷이라 하는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첫 번째는 승가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僧伽&#32989;</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번역하면 중복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重複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두 번째는 올달라승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21986;&#21630;羅僧伽</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번역하면 상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上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세 번째는 안달바사</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安&#21630;婆娑</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번역하면 하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下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이 세 가지 옷은 모두 지벌라</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支伐羅</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라고 부른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북방의 먼 사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흔히 법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法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라 부르는데</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이는 이것이 가사</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袈裟</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에 해당하며 붉은색이란 뜻이다</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20">.</span> <span data-ke-size="size20">이는 율법의 경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중앙 지방에서는 모두 지벌라라고 말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네 번째는 니사단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尼師但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尼師壇</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번역하면 누울 때 까는 요나 방석을 뜻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다섯 번째는 니벌산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泥伐散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바지 또는 치마</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여섯 번째는 부니벌산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副泥伐散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속바지 또는 속치마</span></p><p><span data-ke-size="size20">일곱 번째는 승각의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僧脚&#27449;迦</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예전에는 복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覆膊</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라 불렀는데</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이는 아마도 오른편을 풀어 헤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며 진정한 의전은 아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설사 오른쪽 겨드랑이를 덮는다고 하더라도 교차하여 왼쪽 겨드랑이도 떠받치게 되면 이는 곧 부처님이 제정하신 옷과 완전히 같아진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또한 여러 갈래의 유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流派</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가 생긴 지 오랜 세월이 지났기에 아무렇게나 규칙을 만들고 비용도 번거롭게 되어</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비록 찾아와서 묻는 사람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충해서 중용을 취하게 되면 이미 성인의 제도와는 어긋나게 되니 스스로 생각해서 용서하여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비록 다시 명문</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明文</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을 제거하거나 고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고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改</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고 한 말은 복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覆膊</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을 고친다는 말이고</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제거한다는 것은 곧 승기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僧祗支</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를 제거해 버릴 뿐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상세한 것은 다른 곳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여덟 번째는 부승각의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副僧脚&#27449;迦</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부암액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副掩腋衣</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p><p><span data-ke-size="size20">아홉 번째는 가야포절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迦耶褒折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몸을 닦는 수건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열 번째는 목거포절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木&#20297;褒折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얼굴을 닦는 수건 </span></p><p><span data-ke-size="size20">열한 번째는 계사발나저게나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38622;舍鉢喇底揭喇呵</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머리를 깎을 때 위에 걸쳐 입는 옷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열두 번째는 건두발나저거탄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建豆鉢喇底車憚娜</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종기를 닦는 옷 </span></p><p><span data-ke-size="size20">열세 번째는 비살사발리색가라</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38814;殺社鉢利色加羅</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약 자료와 도구를 넣어 두는 옷</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34e091d6a2443f408e9aad9ae7a5fbdafb6edcf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34e091d6a2443f408e9aad9ae7a5fbdafb6edcf9" data-origin-width="1193" data-origin-height="679"></div><p>&#160;</p><p><span data-ke-size="size20">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세 가지 옷과 잠자리 도구</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바지가 둘</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걸치는 것도 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몸과 얼굴을 닦는 수건과</span></p><p><span data-ke-size="size20">머리 깎을 때 입는 옷</span></p><p><span data-ke-size="size20">종기를 닦는 옷과 약치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藥直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가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이들 모든 옷에는 마땅히 </span><span data-ke-size="size20">3</span><span data-ke-size="size20">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와 같이 이름을 적어서 간직하고</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잠자리에 깔 도구를 나는 지금 간직하고 있고 이미 옷도 만들었으니</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이곳에서 이를 받아쓰겠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두 번째</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하고</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다른 물건도 이에 준하여 의식을 치룬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대덕이시여</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이러한 열세 가지 생활 용구와 옷 이외에 남아도는 옷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열세 가지 옷 이외에 남아도는 옷이 있다면</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마땅히 두 스승에게나 또는 다른 높은 지위의 스님에게 위탁하여 그 물건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때 다른 필추들에게 말하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구수시여</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기억해 두십시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나 아무개에게는 남아도는 옷이 있으나 아직 밝히지 아니하였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이것은 밝혀야예전에 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淨</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라고 한 것은 뜻을 취한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마땅하겠기에 나는 지금 구수 앞에서 밝혀 오파타야를 위탁하여 맡길 사람으로 삼고 지금 이것을 간직하겠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라고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두 번째</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 가운데서 다만 그 두 스승만을 맡겨 기탁할 사람으로 말한 것은 그 뜻이 그 스승의 옷들은 그 옷에서 떠나 자기에게 책임이 귀속될 누</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累</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가 반드시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또한 시주에게 청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율문</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律文</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에는 다만 바로 아랫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만 하였고</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 사람이 만약 죽었을 때에는 다른 마음 내키는 곳에 보내라고 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다만 이와 같은 한 길이 있으며</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다시 옷을 분별함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 결정하라고 하였으며</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다시 전해 오면서 진실한 일을 말한 구절은 없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설사 다른 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짐짓 이 율부</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律部</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의 가르침은 아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무릇 </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위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委寄</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을 밝히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위임하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장애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여섯 가지 일을 마음속으로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면 일을 이룰 수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첫 번째는 </span><span data-ke-size="size20">3</span><span data-ke-size="size20">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衣</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를 지키고 간직하는 것</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p><p><span data-ke-size="size20">두 번째는 </span><span data-ke-size="size20">3</span><span data-ke-size="size20">의를 버리는 것</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p><p><span data-ke-size="size20">세 번째는 남아도는 옷을 분별하는 것</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p><p><span data-ke-size="size20">네 번째는 별청</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別請</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을 버리는 것</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p><p><span data-ke-size="size20">다섯 번째는 장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長淨</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하는 것</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p><p><span data-ke-size="size20">여섯 번째는 수의</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隨意</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하는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대덕이시여</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잘라서 마름질하지 아니한 옷감도 간직할 수 있습니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합당하지 아니하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러나 반드시 다른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일도 합당할 경우가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대덕이시여</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잘라서 마름질하지 아니한 옷을 입고 마을이나 성안에 들어가도 됩니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안 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러나 반드시 다른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일도 곧 합당할 경우가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대덕이시여</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잘라서 마름질하지 아니한 옷을 입고 외도</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外道</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인 출가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안 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이 집을 나와 외부에 갔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대덕이시여</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잘라서 마름질하지 아니한 옷은 어떻게 지키고 간직해야 합니까</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다음과 같이 지키고 간직하여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간직할 때에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나 아무개에게는 이 옷이 있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나는 지금 이것을 지키고 간직하겠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이것으로 곧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7</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조 가사</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袈裟</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를 만들겠으며</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기단의 격차는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2</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장</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長</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 1</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단</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短</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으로 하겠습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span> <span data-ke-size="size20">반드시 다른 인연이 없다면 나는 곧 빨아서 물들여서 자르고 마름질하고 바느질하여 이곳에서 받아쓰겠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두 번째</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세 번째에도 이와 갈이 말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5</span><span data-ke-size="size20">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條</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만약 횐 명주나 횐 무명이 있어 두 가지 하의를 만들려고 할 경우에</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인연 가운데서 촉박하여 겨를이 없는 자는 비록 흰 빛깔의 의단</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衣段</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옷감</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라 하더라도 간직하여도 된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만약 그것을 염색하여 만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漫條</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한 폭의 천으로 된 옷</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가 확실하다면 이것은 염색하여도 합당하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또한 계단</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戒壇</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나 도량 안에서 옷을 간직할 때에는 몸 위에 손에 잡히는 옷과 비교하여 간직한다면 이것도 역시 허물이 없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글을 능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참작해서 읽어 보고 간직하면 역시 그것도 간직할 수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span data-ke-size="size20">또한 사미의 무리들이 만조</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漫條</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의 옷을 입고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5</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20">조 가사</span><span data-ke-size="size20">를 높이 걸치고 있는 것은 혼차죄</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渾差罪</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이며 이런 풍조가 중국 땅을 더럽혀 온 지 오래이다</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이런 바람을 부채질하는 것은 비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非法</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을 이루니</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이것을 걸치거나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80a0693926b18bee5788d7a88b3874e4bcf1c18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JZS/80a0693926b18bee5788d7a88b3874e4bcf1c180" data-origin-width="1192" data-origin-height="698"></div><p>&#160;</p><p>&#160;</p>
<!-- -->
카페 게시글
율장
가사
상민 시자
추천 0
조회 53
23.08.11 21:4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