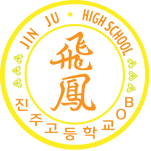<p><b><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이산화탄소&#160;흡수하는&#160;나무의&#160;비밀 </span></b><br><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나무는&#160;엽록소를&#160;통해&#160;햇빛을&#160;받아들이고&#160;유기물을&#160;합성한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지구상&#160;생물&#160;가운데&#160;오직&#160;식물만이&#160;무기물을&#160;유기물로&#160;합성할&#160;수&#160;있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이는&#160;식물이&#160;가진&#160;엽록소&#160;때문에&#160;가능한&#160;일이다.&#160;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엽록소는&#160;지구에&#160;처음으로&#160;나타난&#160;광합성&#160;생물&#160;남세균이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초식동물들이&#160;장내&#160;박테리아의&#160;도움을&#160;받아&#160;섬유질을&#160;분해하듯&#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식물도&#160;남세균의&#160;도움으로&#160;광합성을&#160;한다.&#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수억년&#160;동안&#160;식물세포&#160;안에서&#160;살아온&#160;남세균은&#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엽록체란&#160;이름의&#160;식물세포&#160;속&#160;기관이&#160;되었다. </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ee0ecd68b404883569c83ee77367800dae1ba046" class="txc-image" width="609" height="41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ee0ecd68b404883569c83ee77367800dae1ba046" data-origin-width="1500" data-origin-height="1030"></div><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식물이 햇빛을 이용해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한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광합성을&#160;통해&#160;얻은&#160;에너지는&#160;나무가&#160;생장을&#160;하고&#160;꽃을&#160;피우고&#160;열매를&#160;맺는&#160;데&#160;쓰인다.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식물의&#160;광합성&#160;과정을&#160;분자식으로&#160;표시하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6CO₂(이산화탄소&#160;6)&#160;+&#160;12H₂O(물&#160;12)&#160;→&#160;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6C&#8326;H₁₂O&#8326;(포도당&#160;6)+6O₂(산소&#160;6)+6H₂O(물&#160;6)이&#160;된다.&#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이산화탄소와&#160;물이&#160;나뭇잎&#160;속에서&#160;햇빛을&#160;만나&#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포도당과&#160;산소,&#160;물로&#160;바뀌는&#160;것이다.&#160; </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eb4be1d597eeb17ca1ecc4a89d6a2df26943909b" class="txc-image" width="299" height="18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eb4be1d597eeb17ca1ecc4a89d6a2df26943909b" data-origin-width="554" data-origin-height="336"></div><p><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식물이&#160;광합성으로&#160;포도당을&#160;만드는&#160;과정에서&#160;이산화탄소는&#160;반드시&#160;필요하다.&#160;</span></p><p><span style="color: #ee2323;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그&#160;과정에서&#160;나온&#160;산소는&#160;필요없는&#160;부산물로&#160;대기중에&#160;발산된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수증기도&#160;같이&#160;발산된다.&#160;</span></p><p><span style="color: #ee2323;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결국&#160;사람을&#160;비롯한&#160;모든&#160;동물들은&#160;나무가&#160;버린&#160;부산물로&#160;삶을&#160;이어온&#160;셈이다.&#160;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매년&#160;나무를&#160;비롯한&#160;식물이&#160;흡수하는&#160;탄소의&#160;총량은&#160;약&#160;3.1기가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바다의&#160;식물성플랑크톤이&#160;흡수하는&#160;탄소량은&#160;2.9기가톤에&#160;이른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인간문명이&#160;연간&#160;배출하는&#160;10.1기가톤의&#160;탄소&#160;가운데&#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절반&#160;가량이&#160;식물체의&#160;광합성으로&#160;흡수된다. </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0ab5e940f6618604d62a9fa3216266d0e930bb4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0ab5e940f6618604d62a9fa3216266d0e930bb4c"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515"></div><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지구의 숲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바이오매스를 만들어내는데,&#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그&#160;총량은&#160;연간&#160;1기가톤에&#160;이른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나무는&#160;대기중&#160;탄소를&#160;흡수해&#160;자기&#160;신체조직으로&#160;바꾼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이&#160;과정에서&#160;햇빛&#160;에너지가&#160;나무&#160;몸속에&#160;축적된다.&#160;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태양이&#160;100의&#160;에너지를&#160;주면&#160;나무가&#160;몸속에&#160;축적하는&#160;에너지는&#160;2&#160;정도&#160;된다.&#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나무에&#160;축적된&#160;바이오매스&#160;에너지량은&#160;같은&#160;부피&#160;석유나&#160;석탄의&#160;<b><span style="color: #ee2323;">50%</span></b>에&#160;이른다.&#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석유&#160;석탄&#160;같은&#160;화석연료는&#160;모두&#160;4억년&#160;전&#160;지구에&#160;살았던&#160;식물체의&#160;화석이다.&#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4억년&#160;전의&#160;햇빛&#160;에너지가&#160;나무에&#160;축적된&#160;것이다.&#160;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원래&#160;지구&#160;대기의&#160;80%는&#160;이산화탄소였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화석이&#160;된&#160;나무들은&#160;80%에&#160;이르는&#160;이산화탄소를&#160;흡수해&#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포도당으로&#160;바꾸고&#160;그&#160;과정에서&#160;산소를&#160;배출해&#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지금의&#160;지구&#160;대기&#160;환경을&#160;만든&#160;우리&#160;조상들이다.&#160;</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그&#160;조상들을&#160;땅에서&#160;꺼내&#160;태우고&#160;자동차를&#160;굴린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온실가스니&#160;기후변화니&#160;불평까지&#160;한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조상무덤 부관참시하는 문명이 얼마나 갈까?</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a64cd55dcc715bf97be4d92cdc417ba95316861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a64cd55dcc715bf97be4d92cdc417ba953168615" data-origin-width="640" data-origin-height="960"></div><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 40년생 느티나무. 이런 큰키나무들은&#160;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자신이&#160;서&#160;있는&#160;토양면적의&#160;1000배가&#160;넘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이파리&#160;표면적을&#160;갖는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남준기 namu@naeil.com</span></p><hr data-ke-style="style3"><p><span style="color: #781b33;"><b><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홍슈의 딴지]</span></b></span></p><p><span style="color: #781b33;"><b><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그러면 인간도 광합성을 하면<br>식량문제도 해결되고, </span></b></span></p><p><span style="color: #781b33;"><b><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span></b></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1d5065ea3fdf8b2078ce11cb77a4fb22a9962b2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1d5065ea3fdf8b2078ce11cb77a4fb22a9962b22" data-origin-width="1280" data-origin-height="720"></div><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6dd7;" data-ke-size="size16"><b><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체내에 엽록체 이식하면 사람도 스스로 광합성 가능할까?</span></b></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광합성 공장으로 불리는 엽록체는 식물과 동물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식물은 엽록체에서 태양빛을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반면 동물은 식물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영화 속 설정처럼 <span style="color: #ee2323;">혈액에 엽록체를 이식한다는 기발한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ee2323;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이론적으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61e21652d4bbe11360722ac5304467d51eb98ce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61e21652d4bbe11360722ac5304467d51eb98ce1"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265"><div class="figcaption">영화 ‘유리정원’엔 인공체를 이용한 인공혈액을 개발하려는 과학자가 등장한다.&#160; 공상과학(SF) 속에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실제로 바다 생태계엔 산호나 도롱뇽처럼 엽록체를 몸속에 지니고 있어 광합성이 가능한 동물이 일부 있다. 리틀빅픽쳐스 제공</div></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fc26da39ba6a1e49880fdaa739610f6be0fc505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fc26da39ba6a1e49880fdaa739610f6be0fc5056" data-origin-width="403" data-origin-height="125"></div><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실제로&#160;가능한&#160;이야기일까.&#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이일하&#160;서울대&#160;생명과학부&#160;교수는&#160;“육상&#160;동물에게&#160;구현하기는&#160;어려운&#160;아이디어”라고&#160;일축했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엽록체가&#160;체내에&#160;이식된&#160;후&#160;계속&#160;재생산되고&#160;기능을&#160;유지하려면&#160;유전자가&#160;약&#160;3000개&#160;필요하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하지만&#160;인간을&#160;비롯한&#160;동물에겐&#160;이&#160;유전자가&#160;없다.&#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엽록체를&#160;이식해&#160;스스로&#160;광합성을&#160;하려면&#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체내에서&#160;식물&#160;유전자까지&#160;만들어낼&#160;수&#160;있어야&#160;한다.&#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또&#160;태양빛을&#160;몸속으로까지&#160;받아들이기&#160;위해&#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span style="color: #006dd7;">피부가&#160;투명해져야&#160;하는데&#160;사실상&#160;불가능한&#160;이야기다.</span> <br></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162b012264ed13a32924479f6f8bf60d65e81f4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162b012264ed13a32924479f6f8bf60d65e81f4d" data-origin-width="229" data-origin-height="220"><div class="figcaption">광합성 피부</div></div><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하지만 이 기발한 상상이 바다에선 현실이 된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이&#160;교수는&#160;“광합성을&#160;통해&#160;스스로&#160;영양분을&#160;생산하는&#160;생물을&#160;‘독립영양체’라&#160;하고&#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다른&#160;생명체를&#160;섭취하는&#160;방식으로&#160;의존해&#160;살아가는&#160;생물을&#160;‘종속영양체’라&#160;한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바다엔&#160;이&#160;두&#160;특성을&#160;모두&#160;갖춘&#160;생명체가&#160;산다”고&#160;설명했다. <br></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79dca7570679e1e6e996910a19c8b0ccfafe3fd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79dca7570679e1e6e996910a19c8b0ccfafe3fdb" data-origin-width="450" data-origin-height="304"><div class="figcaption">해양생물인 푸른민달팽이는 생김새도 나뭇잎과 유사하고 식물처럼 광합성도 한다. 사진 출처 플리커</div></div><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br>해양&#160;생태계에선&#160;광합성을&#160;하는&#160;동물이&#160;있음이&#160;밝혀졌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산호는&#160;바닷속&#160;식물성&#160;플랑크톤을&#160;잡아먹은&#160;후&#160;소화하지&#160;않고,&#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이들이&#160;광합성으로&#160;생산하는&#160;에너지를&#160;받아들인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또&#160;물속에&#160;알을&#160;낳는&#160;일부&#160;도롱뇽은&#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알&#160;속에&#160;식물성&#160;플랑크톤이&#160;들어와서&#160;알이&#160;자라는&#160;동안&#160;에너지를&#160;추가로&#160;공급한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하지만&#160;이는&#160;말&#160;그대로&#160;식물의&#160;광합성&#160;기능을&#160;빌려올&#160;뿐이었다. <br></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2827815898f0c160a27f55607aa5ceebb037794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2827815898f0c160a27f55607aa5ceebb037794b" data-origin-width="250" data-origin-height="327"></div><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2015년 학술지 ‘생물학회보’엔 놀라운 가능성이 제시됐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푸른민달팽이가&#160;플랑크톤으로부터&#160;엽록체를&#160;빌려올&#160;뿐만&#160;아니라&#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엽록체&#160;유지에&#160;필요한&#160;유전자까지&#160;가져온다는&#160;설명이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나뭇잎과&#160;비슷한&#160;외형을&#160;가진&#160;푸른민달팽이는&#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본래&#160;투명한&#160;피부로&#160;태어나지만&#160;자라면서&#160;초록색이&#160;된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플랑크톤을&#160;몸속에&#160;수개월&#160;동안&#160;살려둔&#160;채&#160;광합성을&#160;하기&#160;때문이다.&#160;</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c9f0fdf23fa1bacbeaef9b88cf4e75864ca57c8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c9f0fdf23fa1bacbeaef9b88cf4e75864ca57c81" data-origin-width="504" data-origin-height="468"><div class="figcaption">광합성을 하는 동물</div></div><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연구를&#160;주도한&#160;시드니&#160;피어스&#160;미국&#160;사우스플로리다대&#160;교수는&#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푸른민달팽이가&#160;유전자를&#160;받을&#160;뿐만&#160;아니라,&#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받은&#160;유전자를&#160;자손에게&#160;일부&#160;물려주는&#160;것으로&#160;확인됐다.&#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진화를&#160;거듭하다&#160;보면&#160;먼&#160;미래엔&#160;스스로&#160;엽록체를&#160;생산해&#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span style="color: #006dd7;">광합성을&#160;하는&#160;동물이&#160;탄생할지도&#160;모를&#160;일”</span>이라고&#160;말했다. <br></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efbbd77a8794dee4175dbd04d3732be0f36ebb8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efbbd77a8794dee4175dbd04d3732be0f36ebb8e"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360"></div><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일부 과학자는 고등동물에 광합성을 구현해</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물고기가&#160;주요&#160;대상이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실제로&#160;미국&#160;하버드대&#160;연구진은&#160;2011년&#160;제브라피시의&#160;알&#160;안에&#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엽록체를&#160;가진&#160;미생물을&#160;주입하는&#160;실험을&#160;진행했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물고기는&#160;알에서&#160;부화한&#160;뒤에도&#160;2주&#160;정도&#160;엽록체를&#160;보유했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엽록체가&#160;몸속에서&#160;증식하진&#160;못했지만</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짧은 기간이라도 물고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br></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8c51a3fe572e23b1df88b82d238e276229b7f00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8c51a3fe572e23b1df88b82d238e276229b7f006" data-origin-width="400" data-origin-height="241"><div class="figcaption">광합성을 하는 '슈렉'</div></div><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윤환수 성균관대 교수는&#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푸른민달팽이&#160;외에도&#160;아메바의&#160;일종인&#160;폴리넬라&#160;역시&#160;</span></p><p><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다음&#160;세대에&#160;엽록체를&#160;물려준다는&#160;사실이&#160;밝혀졌다.&#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span style="color: #006dd7;">영화&#160;속&#160;설정이&#160;완전히&#160;허무맹랑한&#160;이야기는&#160;아니다”</span>고&#160;말했다.</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08ad0a706017735886e0b90a09e1eb0673c689a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SQ1/08ad0a706017735886e0b90a09e1eb0673c689a2" data-origin-width="220" data-origin-height="201"><div class="figcaption">지금, 광합성 중이라고!!!</div></div>
<!-- -->
카페 게시글
세상읽기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나무의 비밀 & 동물 광합성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