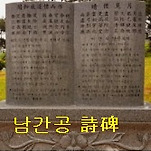<DIV class="bbs_contents " id=bbs_contents>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
<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XSCRIPT type="text/xxxxxxxxjavascript"></XSCRIPT></TD></TR></TBODY></TABLE></DIV></DIV></DIV>
<P>&nbsp;</P>
<P>&nbsp;</P>
<DIV class="bbs_contents " id=bbs_contents>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
<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
<xSCRIPT type=text/xxjavascript>//<![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xSCRIPT>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1. &lt;남간&gt; 寄谿谷机下/季秋晦 南磵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계곡의 궤하에 부치다, 늦가을(9월) 그믐 남간</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山河阻絶夢尋</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餘</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산하조절몽심여)/산하는 막히고 끊겼는데 꿈속에서나마 그대 찾을 수 있을까</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無期漫百</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書</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일면무기만백서)/한번 만나는 것은 기약 없고 백통의 편지만 넘치는구나.</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試向筒中還琢句(시향통중환탁구)/시험삼아 편지속의 시구를 다시 다듬으니</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家人爭笑蚓投</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魚</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가인쟁소인투어)/집사람들 지렁이를 낚시미끼로 물고기에게 던진다고 다투어 웃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3연은 이미 주고 받은 서찰의 시문을 다시 다듬는 것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일인 줄 여겼는데</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4연에서 집사람이 이를 보고 쓸모없는 미물로 대어를 낚는 미끼로 쓸 수 있다고, 즉 이미 주고받은 시구도 다시 다듬으면 이를 유용하게</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쓸 수 있다는 충고를 以蚓投魚 사자성어를 인용하여 한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夫唱婦隨의 모습을 본 듯하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4연의 蚓投魚는 以蚓投魚의 준말로 즉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다 쓸모가 있다는 뜻의 4자성어를 인용한 것임.</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자강절구(&#33544;薑絶句)/먹는 생강을 읊는 7언절구</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남간이 계곡에게 생강을 보내면서 시문을 동봉한 것이다 -</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贈辛非是贈甘意(증신비시증감의)/매움을 보냄이 단 것을 보낸 뜻과 다르지만</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要在東家不撤</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中</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요재동가불철중)/먹는 것을 그만두지 않은 오직 동가로 보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可愛柔尖兒女指(가애유첨아녀지)/끝이 유연하여 아녀의 손가락 같아 사랑스럽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均粧猶帶淺深</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紅</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균장유대천심홍)/고룬 화장 모습 그대로 얕고 짙은 분홍빛 같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연의 不撤은 《논어(論語)》 향당(鄕黨)에 “생강 먹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不撤薑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동가식 서가숙(東家食西家宿)이란 말이 있다. 동가에서는 먹고 서가에서는 잔다는 뜻으로 이 시의 동가는 아마 여기에서 차용한듯하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생강을 보낼 수 있었다면 계곡이 나주목사로 재임할 때라고 본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629-1630년 사이의 일이라 여겨진다. 남간이 보내는 날이 9월인데, 차운한 답시는 10월10일 인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lt;계곡&gt;차운하여 나응서에게 수답하면서 생강을 보내준 데 대해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사례하다[次韻&#35446;羅應瑞兼謝餉薑] 10월10일</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계곡집 제33권 / 칠언 절구(七言絶句) </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才情衰歇頓無</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餘</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재정쇠헐돈무여)/재주도 감정도 이제는 남김없이 쇠한 몸</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抛却西窓滿架</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書</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포각서창만가서)/서쪽 창가 가득 꽂힌 책들 내버려 두었소.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唯有故人能好事(유유고인능호사)/아직도 시 짓는 데 열심인 우리 벗님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每將佳什伴雙</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魚</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매장가십반쌍어)/서신에다 멋진 시편 매번 부쳐 주는구려</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 </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新薑遠寄意重重(신강원기의중중)/멀리서 보낸 햇생강 어찌나 고마운지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知自溪莊露圃</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中</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지자계장노포중)/시냇가 별장 채마밭에서 금방 캐낸 것 알고 있소.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忽憶錦江風味別(홀억금강풍미별)/홀연히 생각나는 영산강의 별난 풍미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金&#34368;斫膾&#23280;芽</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紅</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금제작회눈아홍)/불그스름 여린 싹들 금제작회의 맛이라니 </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8연의 금제작회(金&#34368;斫膾)는 서리 내린 뒤 석 자 미만의 농어[&#40056;魚]를 잡아 회를 뜬 뒤 향기롭고 부드러운 화엽(花葉)을 잘게 썰어서 묻혀 먹는 것으로, 예로부터 가미(佳味)로 일컬어져 시 속에 많이 등장한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7연의 영산강에서 갓 잡아 올린 농어며 숭어회를 계곡은 먹어보았던 것이다. 이 회에는 반드시 생강의 양념이 들어가야 제 맛인데, 금제작회로 비유하여 주었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TD></TR></TBODY></TABLE></DIV></DIV></DIV>
<P>&nbsp;</P>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
<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
<xSCRIPT type=text/xxjavascript>//<![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xSCRIPT>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2. &lt;남간&gt;得谿谷書仍吟寄呈</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634년 9월</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남간집에 의하면 1634년 9월의 </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得谿谷書仍吟寄呈은 시 3수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제1수는 이미 필자가 소개해 드린 相公書札適然來의 시문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본란에서 소개하는 시문 2수는 사실은 得谿谷書仍吟寄呈 시 3수중에 제2수, 제3수에 해당한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아마 시찰이 각각의 종이에 써졌기 때문에 훗날 계곡이 차운한 시문을 보낼 때에 이를 혼동하였던지, 각각의 시문에 대하여 차운할 수 있는 것부터 詩作을 하여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SPAN></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千里山河日字</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難</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천리산하일자난)/천리산하 먼 곳에 있어 날짜 세는 것 어렵고</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春宵坐久燭仍</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殘</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춘소좌구촉잉잔)/봄날 밤 오래앉아 있으려니 촛불이 가물거린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兒孫晝立煩何有(아손주입번하유)/낮에는 어린 자손들이 어찌나 번거롭게 하는지</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明日晴窓盡意</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看</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명일청창진의간)/밝은 날 개인 창가에서 뜻을 다하여 보련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杳杳秦關阻己</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知</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묘묘진관조기지)/아득한 진관이 나를 알아주는 것 막고 있으니</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郵筒那得遞新</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詩</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우통나득체신시)/우편으로 어떻게 새로운 시를 부치리요.</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近來余髮無由變(근래여발무유변)/근래에 나의 머리 변할 수가 없겠지만</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願使白間生黑</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絲</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원사백간생흑사)/하얀 실낱 속의 검은 실낱 생기기를 바라노라.</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제2수 1연은 杳杳秦關阻</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知己로 남간집은 인쇄되어 있는데, 차운의 내용으로 보면 </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杳杳秦關阻己</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知로 되어야 맞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知己(자기의 속마음을 지극하고 참되게 알아 줌)로 해설하면 문맥이 맞지 않고 오히려 앞뒤 문맥으로 보아 己知(나를 알아주는 것)로 표현해야 타당해진다.</SPAN></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진관은 중국 함곡관(函谷關)을 말한다. 함곡관은 지세가 험하여 지키는 병사 2명이면 오는 군사 100 명을 당할 수 있다 하여 일컬은데, 그러한 험한 지세 같은 진관이 가로막고 있으니 어찌 나를 알아주겠는가하는 은근한 표현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이것은 오직 문학만의 맛이라 할 수 있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lt;계곡&gt;나 동년 응서에게 수답하다[酬羅同年應瑞]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계곡집 제33권/ 칠언 절구(七言絶句) </SPAN></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나 동년 응서에게 수답하다[酬羅同年應瑞] </SPAN></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病裏吟詩也自</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難</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병리음시야자난)/병중에 시 읊는 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려운 일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霜&#39661;欲撚半凋</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殘</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상자욕년반조잔)/흰 수염 비비 꼬려 해도 반쯤 골아지려 한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今朝作意聊拈筆(금조작의료념필)/오늘 아침 마음먹고 기운을 내어 붓을 들고 글을 써서</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寄與情人仔細</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看</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기여정인자세간)/그리운 그대에게 부치노니 잘 살펴보아 주오 </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書到殷勤意可</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知</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서도은근의가지)/서찰이 와서 은근한 뜻은 잘 알겠소만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怪君偏愛病夫</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詩</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괴군편애병부시)/아픈 이 사람의 시를 그대는 지나치게 좋아해 이상할 정도요.</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自慙却老元無賴(자참각노원무뢰)/내 부끄럽소, 원래 염치도 없는 사람이 늙음을 막으려 하다니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鏡裡新添滿&#39714;</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絲</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경리신첨만빈사)/거울 속의 새로 더한 흰머리 몰라보게 늘어났구려. </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이때쯤의 계곡은 매우 병약한 상태인 것 같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남간보다 3살 더 어리지만 더 늙어 보이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붓을 들기가 귀찮을 정도로 허약해진 듯하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그래도 남간의 시찰이 오면 어찌어찌 노력하여 답시를 보내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문제는 초벌번역에서 도무지 두 분의 속셈, 진심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조잡한 번역이라는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초벌번역을 대외에 공포한 것은 두 분의 시심에 누를 끼치는 것 같은 심정이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직역과 의역을 조화롭게 하면서 문학적 영감을 녹여 넣어야 하는데, 초벌번역은 도저히 두 분의 진심을 읽어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제8연은 보내온 시에 “흰머리 사이로 흑발이 나게 하였으면[願使白間生黑絲]”이라는 구절이 있었으므로 그 뜻에 답한 것인데, 이는 대체로 자소(自笑)하면서 동시에 자탄(自嘆)한 것이었다. </SPAN></P></TD></TR></TBODY></TABLE></DIV></DIV>
<P>&nbsp;</P>
<DIV class="bbs_contents " id=bbs_contents>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nbsp;</DIV></DIV></DIV>
<DIV class="bbs_contents " id=bbs_contents>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
<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
<xSCRIPT type=text/xxjavascript>//<![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xSCRIPT>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4. &lt;남간&gt; 奉謝谿谷惠和(봉사계곡혜화)/계곡의 화답에 사례하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日長槐夏坐胡</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床</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일장괴하좌호상)/해가 긴 巳月 槐夏에 의자에 앉았는데</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好事南風吹報</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章</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호사남풍취보장)/남풍이 바람에 실어 답글을 보내 주니 좋은 일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昨夜江湖虹貫月(작야강호홍관월)/어젯밤 강호에 무지개가 달을 꿰기에</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知公文吐&#29191;天</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光</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지공문토설천광)/그대 문장이 토한&nbsp; 불사르는 하늘 빛인줄 알았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此生何幸拜龐</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床</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차생하행배방상)/이 생애에 방덕공을 뵙는 것이 얼마나행운일까.</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每歎風林虎豹</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章</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매탄풍림호표장)/매양 눈에 띠는 풍림속의 호랑이, 표범 무늬인 것을 탄식하다가</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忽得新詩寒竪髮(홀득신시한수발)/홀연 새 시를 지어 머리끝이 쭈빗 섰는데</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還慙夜燎比朝</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光</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환참야료비조광)/밤 모닥불 아침 햇빛에 비하니 오히려 부끄럽구나.</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제1수 1연의 괴하는 달을 나타내는 낱말로 4월(巳月)은 건월(乾月), 괴하(槐夏), 괴훈(槐薰), 맥량(麥凉), 맥추(麥秋), 맹하(孟夏), 사월(巳月), 수요절(秀&#33917;節), 시하(始夏), 앵하(鶯夏), 여월(余月), 유하(維夏), 입하(立夏), 정양(正陽), 중려(仲呂), 청화절(淸和節), 초하(初夏) 로 나타낸</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胡</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床은 중국식 접이 의자를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제2수 1연의 龐은 龐德公을 지칭한다. 한나라 말기의 방덕공은 녹문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면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隱者를 비유하기도 한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연은 아마 꿈 이야기인 것 같다. 밤에 뜨는 무지개는 없다. 하지만 꿈은 가능한 것이다. 꿈속에서 무지개가 달을 꿰는 그 뜻이 4연에서 그대 문장이 토해내는 태양 빛으로 보았다는 것은 계곡의 문장을 극찬한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제2수 1연은 隱者의 대명사격인 방덕공을 뵌다는 것은 이 생애 최대 행운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는 표현은 방덕공을 만날 수 없다는 비유법이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방덕공처럼 개인 색깔과 무늬가 뚜렷하면 아무리 풍림에 숨어 있어도 호랑이, 표범이 무늬 때문에 발견되듯 그것을 탄식한다는 된다는 것이요.</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시인들은 시상이 떠오르면 머리가 갑자기 쭈빗 해지는데, 그러한 영감으로 시를 지어 봤지만 그 시를 다시 보니 저녁 모닥불 빛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침 햇살과 비교하니 오히려 부끄럽다는 의미이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필자가 이렇게 두 분의 시문을 번역하고 있지만, 더 높은 식견의 가진 자에 비하면 항상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lt;계곡&gt;나 동년 응서에게 화답하여 주다[和贈羅同年應瑞] /추석</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계곡집 제33권/ 칠언 절구(七言絶句) </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상은 곧 평상 床인데, 계곡은 똑같은 의미의 평상 牀으로 차운하여 글을 지었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半生穿盡管寧</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牀</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반생천진관녕상)/</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반평생 앉아서 닳고 구멍 뚫린 管寧의 의자</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餘事奚囊錦繡</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章</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여사해낭금수장)/비단을 수놓은 시 보따리는 여가의 취미로다</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休恨風塵少知己(휴한풍진소지기)/풍진 세상 나를 아는 자 적다고 무엇을 한하랴만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斗間應有識龍</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光</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두간응유식룡광)/두간모옥에 있는 용의 빛 알아 볼 이 있으리다 </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狂吟拍碎讀書</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牀</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광음박쇄독서상)/독서 의자가 떠나갈 정도로 미친 듯이 읊조리고</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每得君詩怯和</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章</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매득군시겁화장)/그대의 시 받고 나면 화답하기 겁이 나오</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32763;訝向來遭按劍(번아향내조안검)/지금껏 안검 당하신 게 도리어 괴이하오.</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暗中珠玉自生</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光</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암중주옥자생광)/어둠 속에 주옥이 절로 빛을 발하는 걸</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 </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제1수는 계곡이 남간을 비유하여 쓴 글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반평생 앉아 있다는 것은 隱者를 말하며, 숨어 살면서 시를 써서 보따리에 저장하듯 많다는 비유인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이 풍진 세상에 나를 아는 자 적다고 한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두간모옥에 사는 남간을 알아본다고 비유하였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연의 관녕(管寧)은 후한의 명사로 , 화흠 등과 동문수학한 사이로서 요동의 공손도 밑에서 30여년동안 은둔 생활을 계속했다. 조조, 문제, 명제 등이 초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난을 피하여 요동에 가서도 항상 흰 두건을 쓰고 이층에 거처하여 땅을 걷지 않았으며 위(魏)에서 벼슬하려 하지 않았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진(晉) 나라 황보밀(皇甫謐)의 《고사전(高士傳)》 관영조(管寧條)에 의하면, 관영이 55년 동안 나무로 만든 탑상(榻牀)에 앉아 있었는데, 단정한 자세를 한번도 잃은 적이 없었으므로, 무릎 닿는 곳에 모두 구멍이 뚫렸다[榻上當膝皆穿]고 한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연의 해낭(奚囊)은 시 보따리의 뜻이다. 당(唐) 나라 이상은(李商隱)의 ‘이장길 소전(李長吉小傳)’에 의하면, 장길이 제공(諸公)과 놀러 나갈 때마다, 어린 종복[奚奴]이 오래되고 허름한 금낭[古破錦囊]을 등에 지고 그 뒤를 따라다녔는데, 장길이 새로운 시를 짓고 나면 곧장 그 금낭 속으로 던져 넣었다고 한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4연은 斗間은 斗間茅屋 즉 발을 뻗으면 벽이 닿는 오종종한 작은 방을 의미하는 것에서 인용한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溪亭은 마치 두간모옥 같다. 두간모옥에 사는 용으로 남간을 비유한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남간집 초벌 번역을 보면 斗間은 두성(斗星)과 우성(牛星) 또는 북두성(北斗星)과 견우성(牽牛星)을 말하고 용광의 빛으로 땅속에 묻힌 보검을 찾는다는 고사를 인용하였지만, 남간의 계정을 두간모옥으로 보면 필자의 해설이 더 타당할 것 같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제2수는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3연의 안검은 남간의 시문이 세상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을 말한다. 《사기(史記)》 노중련(魯仲連)의 추양열전(鄒陽列傳)에 “명월주(明月珠)와 야광벽(夜光璧)을 어둠 속에서 길가에 내던지면 칼자루를 잡고서[按劍] 노려보지 않는 자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뜻은 길거리에 떨어진 것들이 잘 갈아진 칼날처럼 빛나고 있어서 혹여 칼을 빼들고 달려든다는 뜻이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남간의 시문이 명월주 같은데 어느 누구도 칼을 빼들고 명월주를 바라보는데, 명월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즉 세상이 남간의 시문을 제대로 평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DIV class="bbs_contents " id=bbs_contents>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
<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
<xSCRIPT type=text/xxjavascript>//<![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xSCRIPT>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15. &lt;남간&gt; 春間早梅(춘간조매) /봄에 일찍 핀 매화</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冷香淸彩兩交</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加</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냉향청채양교가)/차가운 향기 맑은 빛깔로 사귀어서</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五出花兼六出</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花</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오출화겸육출화)/오출화의 매화와 육출화의 눈꽃이 함께 하도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南北幾枝無早晩(남북기지무조만)/남북에 몇 가지가 꽃핌이 이르고 늦음이 없어</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一般疎影水邊</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斜</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일반소영수변사)/똑같이 듬성한 그림자 물가에 비켜 있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川上月下吟(천상월하음)</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냇물 위에서 달빛 아래를 읊다/ 늦봄</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川光受月月籠</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川</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천광수월월농천)/강 빛은 달을 받고 달빛은 강을 덮어</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潑潑躍金風露</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天</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발발약금풍로천)/달빛이 물에 비치어 출렁이는 금빛은 하늘의 바람과 이슬</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此是無心相映燭(차시무심상영촉)/이것은 무심히 서로 비치는 촛불 같은데</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誰人看作妬淸</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姸</SPAN><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수인간작투청연)/그 누가 맑고 고움을 시새운다고 보는가</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제1수 2연의 육출화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아가는 여섯가지 덕목이 고루 갖춘 길이라 하여 벼슬을 일러 육출화(六出花)라 하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장안에 사는 사람치고 六出花의 말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벼슬자리를 속된 은어로 「눈꽃이 피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벼슬 잔치를 육화무(六花舞)라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눈꽃에서 비롯된 말이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눈꽃에는 여섯가닥의 꽃잎이 있어 육출화(六出花)라고 부르기도 했는데</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일출(一出)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니 치부(致富)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이출(二出)은 벼슬 호칭과 그에 따른 영예나 예우가 평생 따른다는 것이요</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삼출(三出)은 죽어서도 묘비에 그 벼슬의 이름이 오르고,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사출(四出)은 족보에 벼슬이 올라 후손 대대로 그 벼슬의 덕을 본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오출(五出)은 벼슬과 더불어 부역이나 공역(貢役)을 면제받고,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육출(六出)은 사는 집의 칸수나 높이, 그리고 대문의 구조, 묘역의 넓이,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부인의 옷 치장이나 머리의 모양새까지 벼슬 품수에 따라 달라졌으니,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이미 그때부터 벼슬은 나라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자리로 매겨지고 있었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본시에서는 눈꽃을 말한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제2수 2연의 潑潑은 소동파에 의하면 “달빛이 물에 비치어 떠서</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움직이는 모양“이라 하였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lt;계곡&gt;차운하여 나 동년 응서에게 수답해 보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次韻寄&#35446;羅同年應瑞]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계곡집 제33권/ 칠언 절구(七言絶句) </SPAN></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年來衰與病兼</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加</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년내쇠여병겸가)/최근 몇 년 쇠한 데다 병까지 겹치고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39714;有繁霜眼有</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花</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빈유번상안유화)/귀밑털은 흰 서리 무성한데 눈은 꽃만 보이는구나.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忽見故人書信到(홀견고인서신도)/옛 친구가 보내준 서찰 홀연히 보니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滿&#29259;詩筆半&#27449;</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斜</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만전시필반의사)/편지 가득 시필들 반쯤 기울었구나. </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幽居長憶俯晴</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川</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유거장억부청천)/맑은 내 굽어보는 그대의 집 늘상 생각나나니</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城市中藏小洞</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天</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성시중장소동천)/도시 속에 감추어진 조그마한 별천지라</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肯向宦途爭利鈍(긍향환도쟁리둔)/벼슬길 올라 승부 겨룰 생각이 무디어지니</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獨憑詩態鬪淸</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姸</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명조">(독빙시태투청연)/</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홀로 詩態에 기대어 그의 맑고 고움만 </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다투는가.</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제1수는 계곡이 최근 몇 년간 아파서 몸은 쇠약해지고 귀밑의 털은 백발이 되어 가는데, 눈만은 살아서 아름다운 꽃을 보려한다고 표현하면서, 남간 옛 친구가 보내준 서찰을 보니 시필들이 반쯤 기우러져 있다는 것은 자신이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없는 병약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제2수 1연의 청천(晴川)은 비가 온 뒤 맑게 갠 날의 시냇물로, 당(唐) 나라 최호(崔顥)의 시 ‘황학루(黃鶴樓)’에 “비 갠 강엔 선명한 한양의 나무, 방초 금새 무성해진 앵무주로다.[晴川歷歷漢陽樹 芳草&#33803;&#33803;鸚鵡洲]”라는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여 남간의 계정이 바로 청천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청천 변에서 마치 소천동(작은 별천지, 작은 하늘동네)을 이루며 사는 남간이니 벼슬길 올라가는 승부를 겨룰 생각이 무디어지고, 남간은 오직 시에 매달려 시의 맑음과 고움만을 다투고 있다고 노래하였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필자가 계곡집에서 찾아낸 남간의 차운 시편을 중심으로 계간수창의 시문을 재해석 하였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이미 번역한 것을 필자는 초벌 번역이라 하였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초벌번역은 반 번역이라 할 수 있어서 한학, 고사에 대해 식견이 있는 자는 이해를 하지만 그에 대해 식견이 낮은 자는 시 문맥을 이해하기 힘든 번역인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필자의 2차 번역이 최고의 품질이라고 자랑하지는 않는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필자도 시를 쓰는 사람이고, 시인의 눈으로 보는 두 분의 시심을 바탕으로 번역하였기에 조금은 두 분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끝으로 남간 할아버지 글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 남간할아버님이 보이는 것 같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호리호리하고 야윈 키에 코는 오똑하여 傲氣는 하늘을 찌르고, 부귀공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 보인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충효의 정신이 올바르게 서 있어서 국가 위난시마다 의병에 참가하여 앞장섰으며, 起義에 대한 호소의 글을 쓰기도 하였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참으로 장 계곡 같은 좋은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 있었고, 계곡은 관직의 길로, 남간은 초야의 선비로 끊임없이 서찰을 통한 대화를 통해 인간수업, 인생 수업, 자아실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초야의 선비는 계간 수창의 자료를 잘 모아 두었다가 후손들이 문집으로 발간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는데, 남간집에서는 더 많은 부분의 계간 수창 있음을 볼 때,&nbsp; 계곡집에서는&nbsp;</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일부 누락이 된 것을 보면, 오랜 투병생활로 서찰의 간수를 잘 못했던 것 같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앞으로 계곡 후손 측에서는 잃어버린 계곡의 글을 찾으려면 나주나씨 남간파 종중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SPAN></P>
<P class=바탕글>&nbsp; </P></TD></TR></TBODY></TABLE></DIV></DIV></DIV>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TD></TR></TBODY></TABLE></DIV></DIV></DIV>
<P>&nbsp;</P>
<P>&nbsp;</P>
<!-- -->
카페 게시글
남간문학방
계간수창 시 감상 (11,12,13,14,15)
나씨아줌마
추천 0
조회 106
10.10.16 23:2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