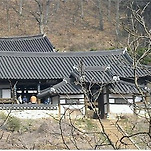<!--StartFragment--><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烟村遺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는 조선 문종 때 명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名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烟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덕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崔德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문집인데 전남유형문화재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8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녹동서원소장목판및고문서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핵심 내용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정유재란 때 전주와 영암이 일본군에 함락되면서 불타고 흩어져버린 것을 전쟁이 끝난 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2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광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부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3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인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까지 연촌공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손 기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棄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정</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수습하여 재정리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유미사송최선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비롯하여 많은 저명인사들이 지은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와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비록 임진왜란 이후에 재정리된 것이기는 하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 시기가 비교적 이른 편이어서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조선전기 인물들의 문집 중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수록된 글을 가져다가 수록한 것이 적지 않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은 월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月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崔&#3870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아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형제 중에서 막내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84</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우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전주에서 태어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장형 송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松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광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崔匡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와 중형 송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松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직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崔直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8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공양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고려 문과에 함께 급제하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두 형님은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권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 또한 권근의 제자라고 전해오고 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해동명신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海東名臣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는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양명</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권근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0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태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죽은 것을 근거로 추정해 볼 때 어릴 때는 형님들의 스승 권근에게서 배우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조정에 출사한 이후부터는 이양명에게서 배운 것으로 보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0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태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김종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송을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등과 함께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듬해에 어머니 전주박씨가 돌아가시므로 인하여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상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喪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로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간 거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居喪</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하였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0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에야 처음 벼슬에 나가서 교서관 정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10),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사헌부 감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17),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예조 정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0?),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함양 군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5),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청도 군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30),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김제 군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3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역임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4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8)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남원 부사를 마지막으로 벼슬을 버리고 영암으로 낙향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존심양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存心養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학문의 핵심 명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命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로 내 세우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서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書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지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존양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存養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라고 이름 짓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존양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存養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으로 바꾸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조선은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삼았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성리학은 고려후기에 원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서 들어온 새로운 학문으로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체계화 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이 수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修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철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哲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핵심 명제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존심양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주장하고 그 수행 방법과 수행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립함으로 인하여 훗날 사림파 유학자로 일컬어지는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김굉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등이 전수받아 조선 성리학의 수기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이 벼슬을 버리고 은거할 때 그 장소를 고향 전주가 아닌 영암으로 정하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영암의 영보촌은 후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後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평양조씨의 친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親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으로 그 당시 보편적이던 처가살이 전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또한 당시에는 이미 아버지 월당공과 어머니 전주박씨가 모두 돌아가셨지만 장모 효열김씨는 영암에서 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5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2)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문종이 즉위하면서 예문관 직제학을 제수하므로 다시 벼슬에 나가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성균관 사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공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貢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참시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춘추관 기주관 등을 역임하였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고려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편찬에 참여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5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문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1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은퇴 상소를 올려 임금의 윤허를 받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일에는 한강변에서 대규모의 송별연이 열리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유미사송최선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은 바로 그 송별연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지어 준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와 글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의 은퇴는 당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문종실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수록되어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 이유는 연촌공은 벼슬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또 임금이 총애하여 계속 승진시켜 곁에 두고자하면서 은퇴하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좌의정 김종서 등 친구들도 계속 벼슬에 머물 것을 권유하였으므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은퇴하지 않고 가만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더 높은 벼슬로 승진할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권유를 뿌리치고 스스로 물러나 자신이 주창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존심양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라는 수기 철학을 몸소 실천하였기 때문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처음부터 끝까지 의리를 온전하게 지키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공 같은 분이야말로 나의 스승이 되시리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終始能全義如公我所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라고 읊은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성삼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시문을 통하여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각주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최정</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崔珽</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568~?)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기정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棄井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중랑장공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영암종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령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지성</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파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생원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生員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휘 응봉</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應鳳</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아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몽응공 휘 응룡</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應龍</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조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로 정유재란 때 불타고 흩어져버린 문헌을 모으고 정리하여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참의공유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와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연촌유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를 만들었고 영암읍에 존양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녹동서원의 전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를 건립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권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權近</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352~1409)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안동권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초명 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晉</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가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可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사숙</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思叔</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양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陽村</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소오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小烏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친명정책을 주장하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조선 개국 후 사병 폐지를 주장하여 왕권확립에 공을 세웠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길창부원군에 봉해졌으며</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대사성</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자좌빈객 등을 역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문장에 뛰어났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경학에 밝아 사서오경의 구결을 정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연촌공 형제의 스승으로 전해 온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양명</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李陽明</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태종이 원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양녕대군</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교육을 위해 세운 원자부 우시학을 역임하고 언관으로 근무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강직한 성품으로 태종의 잘못을 비판한 죄를 입었으나 끝내 굽히지 않았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해동명신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에는 연촌공의 스승이라고 적혀 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종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宗瑞</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383~1453)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순천김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국경</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國卿</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절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節齋</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05</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년 연촌공과 함께 문과에 급제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하고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진을 설치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정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수양대군에 의해 집에서 맞아 죽고 대역모반죄라는 누명을 쓰고 계유정난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송을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宋乙開</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여산송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05</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태종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연촌공과 함께 문과에 급제 정언을 지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18</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년 박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朴習</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옥사에 연루되어 삭탈관직 당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굉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宏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54~1504)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서흥김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대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大猷</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사옹</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蓑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한훤당</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寒暄堂</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시호 문경</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文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종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宗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문하에서 배웠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특히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소학</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에 깊이 빠져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소학동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라 자칭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무오사화로 유배지에서 조광조</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趙光祖</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를 만나 학문을 전수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산당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山堂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휘 충성</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忠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과 친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스승이라고도 한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성삼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成三問</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18~1456)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창녕성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근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謹甫</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눌옹</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訥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매죽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梅竹軒</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시호 충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忠文</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사육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종 때 한글 창제를 위해 음운을 연구하여 훈민정음을 반포케 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단종의 복위를 협의했으나 김질의 밀고로 체포되어 친국을 받고 처형되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이 영암으로 물러난 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5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단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수양대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首陽大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계유정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일으켜 연촌공과 친했던 김종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안평대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安平大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등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은 수양대군을 중국 고대 초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楚</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항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다 비유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일편야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지어 계유정난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일편야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는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김종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의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조의제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弔義祭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으로 되살아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원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의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몽유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夢遊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으로 되살아나 조선 역사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처음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는 사육신을 대표하는 성삼문 마저도 정난공신으로 책봉되는 등 아무도 수양대군의 정권 탈취에 저항하지 못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일편야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저술하여 계유정난의 부당함을 설파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원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 원주로 낙향하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원호의 문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관란유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觀瀾遺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는 원호가 연촌공을 사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思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하여 연촌공의 사례를 본받아 벼슬을 버리고 고향 원주로 낙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또한 원호의 묘비명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훗날 독론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시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은 지금의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백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요 사육신은 지금의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방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라고 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또 말하기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연촌과 무항은 사육신에 비하여 더욱 충성심이 높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라고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 말은 옛 사람에 대한 상론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무항은 바로 공이 살던 마을 이름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연촌은 곧 직제학 최덕지를 말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後之篤論者曰悅卿今之伯夷六臣今之方練又曰烟村霧巷比六臣較高嗚呼此可以尙論古人矣霧巷卽公所居烟村卽崔直學德之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계유정난 발발 당시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직 연촌공과 원호만이 행동으로 계유정란에 저항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고향 원주로 낙향한 원호는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는 선배일 뿐만 아니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계유정난에 저항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연촌공과 교류를 위하여 왕래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 역시 원호의 고향 원주에서 가까우면서 연고가 있는 전주로 옮겨와서 거처하다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5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4</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일 전주 한옥마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현재의 전주최씨 종대 자리에서 돌아가시어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분토동 주덕산에 묻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이 말년을 보내다가 돌아가신 집터는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완동구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라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오다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797</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정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1)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처음으로 시조 문성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文成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崔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시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時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모시면서부터 문성공대종회의 활동이 일상화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필요에 의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80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경부터 전주최씨 종대로 사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숙종 때 노산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魯山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단종으로 복위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사육신의 신원이 회복되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생육신이 지정되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처음에는 연촌공이 생육신으로 거론되었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병자사화</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7)</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전에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생육신으로 적합하지 않다 하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 자리를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남효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8)</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대신하게 되었는데 남효온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54</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단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태어났으므로 병자사화 당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의 아기에 불과하였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육신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六臣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지어 사육신을 선양한 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으로 생육신이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은 단군 이래 훌륭한 신하만 골라 수록했다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해동명신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수록되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조선후기에 이르러 사당이나 서원을 지어 선현을 배향하는 풍속이 번성할 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3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인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영암의 존양사에 처음 배향되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71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숙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9)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녹동서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鹿洞書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으로 사액을 받았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774</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영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0)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임실의 주암서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舟巖書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과 전주의 서산서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西山書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배향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의 저술과 관련 문헌은 연촌공이 돌아가신 직후 막내아들 생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生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崔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의하여 정리되어 전주의 완동구제와 영암의 존양루에 보존되어 전해오고 있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특히 존양루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5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 은퇴할 당시 문종이 어진화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御眞畵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게 명하여 그려서 하사한 초상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보물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94</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도 함께 보존하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임진왜란 때 함경도와 평안도까지 점령한 일본군이 전라도만은 점령하지 못하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정유재란을 일으킨 일본군의 진격 방향이 전라도를 향하면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전주와 영암이 모두 함락되었고 완동구제와 존양루도 피해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각주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계유정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癸酉靖難</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53)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수양대군이 김종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宗瑞</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등 수십 인을 살해하고 정권을 빼앗은 사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9)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항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項籍</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BC232~BC202)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중국 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秦</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나라 말기에 유방</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劉邦</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과 함께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놓고 다툰 무장</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진을 멸망시킨 뒤 회왕</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25040;王</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을 의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義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로 올리고 스스로 초패왕</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楚&#38712;王</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라 했으나 유방에게 패배하여 자살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일편야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一篇野史</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계유정난 직후에 연촌공이 지은 이야기 책</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일편야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을 바탕으로 원호가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몽유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을 지었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종직이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조의제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을 지어 훗날 무오사화의 기폭제가 되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원생몽유록 임제 저작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일편야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가 남효온이 지은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육신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1)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종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宗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31~1492)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선산김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계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季&#26167;</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효관</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孝&#30437;</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점필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20308;畢齋</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시호 문충</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文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성리학계의 대학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제자로 정여창</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鄭汝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굉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宏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일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馹孫</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남효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南孝溫</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7</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 산당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山堂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휘 충성</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忠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등이 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죽은 후 저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조의제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을 김일손이 사초에 넣은 것이 이극돈</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李克墩</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에게 발각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나 부관참시 당하였는데 글 안에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양하는 늙은이의 글을 따라감이여 마음 설레며 공경하고 사모하노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循紫陽之老筆兮思&#34740;&#34611;以欽欽</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라고 연촌공의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일편야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를 참고 했음을 밝히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원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元昊</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396~1463)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원주원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자허</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子虛</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관란</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觀瀾</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무항</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霧巷</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시호 정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貞簡</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생육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23</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종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문과에 급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문종 때 집현전 직제학을 지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계유정난이 일어나자 병을 핑계로 원주로 은거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서쪽에 집을 지어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관란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라 하고 아침저녁 영월 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임금을 사모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단종이 죽자 삼년상을 입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마친 뒤 원주에 돌아와 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앉을 때 반드시 동쪽을 향해 앉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누울 때는 반드시 동쪽으로 머리를 두었는데</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단종의 장릉</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莊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 집의 동쪽에 있기 때문이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일편야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를 지은 연촌공을 복건자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몽유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을 지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시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時習</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35~1493)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강릉김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열경</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悅卿</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매월당</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梅月堂</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법호 설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雪岑</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생육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유불</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儒佛</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정신을 아우른 사상과 탁월한 문장으로 일세를 풍미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금오산실에서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로 알려진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금오신화</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를 지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백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伯夷</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백이숙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伯夷叔齊</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중국 고대 주나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전설적 형제 성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주나라 무왕</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武王</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 은나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殷</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주왕</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紂王</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을 토벌하자 신하가 천자를 토벌한다고 반대하며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首陽山</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방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方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1402</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건문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명나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明</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황위를 찬탈한 연왕</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燕王</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주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朱&#26851;</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에게 항거하다 죽은 방효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方孝孺</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와 주변 사람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완동구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完東舊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전주 감영 동쪽에 있었던 연촌공의 옛 집</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지금의 풍남동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6</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번지에 있는 종대를 말한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7)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병자사화</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丙子士禍</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56)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사육신사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성삼문 등이 세조의 왕권 강화책에 반발하여 단종의 복위를 명분으로 세조를 축출하고자 했으나 배반자의 고변으로 실패한 사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8)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남효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南孝溫</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54~1492)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령남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伯恭</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추강</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秋江</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생육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현덕왕후 능</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복위 상소를 올렸으나 저지당했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갑자사화 때 부관참시 당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저서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육신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추강집</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사우명행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등이 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7</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 산당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山堂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휘 충성</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忠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과 친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다행히 영정은 연촌공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손 몽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蒙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응룡</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기름종이로 여러 겹으로 싸서 산 속에 묻어 둠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완동구제와 존양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리고 그곳에 보존되어 전해오던 수많은 문화재와 문헌들은 일본군의 방화와 약탈로 인하여 잿더미로 변하거나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전쟁이 끝나고 기정공은 불타고 흩어져버린 문헌을 수습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라는 이름으로 재정리하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완동구제와 존양루에서 전해오던 문헌을 중심으로 전주최씨 가문과 다른 집안에 전해오는 문헌도 참고하고 보완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특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17</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광해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9)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간행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곽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문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서포일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西浦日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수록된 시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공원창화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많이 포함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기정공은 정유재란 같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부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部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늘려 이른바 불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不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많은 인쇄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기정공이 돌아가신 후 연촌공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손 양정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養正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방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수년간에 걸쳐서 내용을 다시 보완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72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숙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6)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경에 마무리를 하였으므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는 양정재공에 의하여 최종 정리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특히 뒷부분에 수록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송시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2)</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등의 발문은 대부분 그 때 포함된 것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양정재공 또한 대량으로 인쇄하여 불후하게 만들고자 하였으나 역시 비용 문제로 실천하지는 못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편집만하여 보관하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80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순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녹동서원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근간으로 생육신 원호의 묘비명에서 발췌한 발췌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원직학갈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元直學碣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과 연촌공의 아버지 월당공의 문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참의공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參議公遺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리고 연촌공의 형님 율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栗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득지</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묘갈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소윤공묘갈</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목판을 새기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烟村集</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라는 제목으로 대량 인쇄하여 간행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발행 목적은 부수를 늘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원문 내용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발행 부수가 매우 많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러한 원인으로 현재 여러 중요 도서관은 물론 개인들도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역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譯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또한 목판인쇄본을 소장하고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역자가 소장하고 있는 목판인쇄본을 원전으로 번역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또 녹동서원에서는 연촌공의 손자 산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山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충성</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문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산당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山堂集</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도 함께 간행하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 때 만든 목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木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은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합경당 판각에 소장되어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99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일 전남유형문화재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8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호로 지정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책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80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 발행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만을 번역한 것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원직학갈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참의공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소윤공묘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은 제외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또 원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연촌공이 지은 것으로 확인되는 시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時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헌을 일부 추가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또한 문장의 형식이나 순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수록되어 있는 형식이나 순서를 그대로 따랐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일부 특정 부분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수록 순서를 조정하거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율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律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형식으로 수록된 한 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두 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절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絶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로 나누어 수록하는 등 변화를 주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필요한 곳에는 해설을 추가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최선생유사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선생출처사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은 원래 기정공과 양정재공이 재정리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80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간행할 때 추가된 것이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책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포함시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 저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논공법답험편부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라는 상소문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제존양루이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라는 절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한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연촌공이 지은 시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時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청산이 적요한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가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으므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대동풍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大東風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원전으로 정리하여 포함시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공원에서 함께 노래한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는 연촌공이 공원 참시관으로 계실 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동료 시험관들과 함께 지은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인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만들면서 추가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부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附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풀어서 수록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고증한 내용을 해설로 수록하였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일부 없어진 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대하여서는 없어진 구의 위치를 각주를 통하여 해설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은퇴하실 때 송별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부분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형식이 매우 다양한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다양한 형식에 맞추어 각각 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나누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나눔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서 나눈 연의 형식에 최대한 맞추어 수록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존양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는 형식과 저술 시점에 차이가 큰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들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존양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라는 같은 제목으로 섞여 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이 지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제존양루이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압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6)</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2264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이용한 칠언절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각주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9)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최응룡</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崔應龍</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몽은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蒙恩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중랑장공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영암종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령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지성</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파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1</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생원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生員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휘 낙수</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樂壽</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서자로 정유재란 때 연촌공 초상화를 기름종이에 싸서 묻어 보존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곽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郭說</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548~1630)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청주곽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몽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夢得</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서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西浦</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저서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서포일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 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1)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최방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崔邦彦</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634</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724)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양정재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養正齋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중랑장공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영암종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령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지성</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파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 휘 방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邦彦</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미백</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美伯</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강희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를 만든 참판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參判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휘 세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世榮</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장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강희보 경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는 양정재공의 글씨이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기정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棄井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휘 정</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珽</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 만든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연촌유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를 보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송시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宋時烈</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제자로 저명인사들과 교류를 가졌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2)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송시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宋時烈</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607~1689)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은진송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영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英甫</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우암</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尤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우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尤齋</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노론의 영수</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주자학의 대가로 이이의 학통을 계승하여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루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3)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최득지</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崔得之</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379~1455)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율헌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栗軒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중랑장공파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월당공의 삼남으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96</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태조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 15</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에 생원시와 진사시를 한꺼번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문과는 급제하지 못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13</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태종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조정에 천거되어 내외직에 두루 제수되고 벼슬이 전농 소윤에 이르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4)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소윤공묘갈</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少尹公墓碣</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우리 가문에서 가장 오래 된 금석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중랑장공파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 율헌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栗軒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휘 득지</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得之</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묘비문으로 비문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비석 실물은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57</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조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3</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월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일에 세웠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비석은 현재 전해오지 않고 내용만 전남유형문화재 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83</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녹동서원소장목판및고문서류</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일부로 전해오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5)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최충성</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崔忠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58~1491)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산당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山堂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중랑장공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영암종회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종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宗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제자로 김굉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宏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남효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南孝溫</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등과 친분을 쌓았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병약하여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4</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세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녹동서원에 배향되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굉필의 제자라고 한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6)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압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押韻</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시행</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詩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일정한 자리에 규칙적으로 다는 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 중 몇 수는 칠언율시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제존양루이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전례를 따라 두 수의 칠언절구로 간주하여 정리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 중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석형</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7)</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지은 시는 형식이 특이하므로 따로 분리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추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은 시의 형식이 절구가 아니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압운 또한 다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경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8)</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지은 절구도 압운이 달라 따로 정리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제존양서원병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는 녹동서원의 전신 존양사를 제목으로 한 것이지만 한 수의 시와 작은 서문에 불과하므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존양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말미에 붙여 수록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화상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은 임진왜란 이후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재정리하면서 수록된 시 들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수록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발문 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지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최선생가전시문록후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는 기정공이 처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재정리할 때 수록된 발문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나머지는 양정재공이 정리할 때 포함된 발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발문들은 연촌공의 평가를 주제로 하나의 세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e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구성하고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 중간에 송시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宋時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단하</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질문에 답변하는 편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답이계주임술팔월칠일별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가 있으므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송자대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宋子大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원전으로 번역하여 포함 시키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순서도 문헌의 이해에 편리하도록 조정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발문에서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①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연촌공의 은퇴는 계유정난을 미리 알고 취한 명철보신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②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현인이라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③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연촌공이 미래를 알았다함은 실제는 비웃는 것 아닌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또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김창협</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지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서원청액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는 원래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김진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지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제연촌선생화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뒤에 수록되어 있었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결성을 고려하여 맨 뒤로 옮겨 수록하였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부록으로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조선왕조실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서 연촌공과 관련된 기사를 발췌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해동명신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서 연촌공 기사를 발췌하여 수록하였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의 저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일편야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와 관련이 있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집현전직제학원공</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묘갈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과 원호가 지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몽</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유</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夢遊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리고 김종직이 지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조</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제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弔義帝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번역하여 모두 수록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또한 괄호의 사용은 다음에 따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원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한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나 간단한 해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원문에 발생한 오자의 교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gt; :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문헌이나 글의 제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원문에서 주석으로 기록한 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원전의 제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원문에는 없으나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한 기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는 여러 번 번역되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녹동서원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도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오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誤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역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譯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또한 부족한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오역 없는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하겠지만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부디 심각한 오역만은 없었으면 천만 다행으로 여기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ms-text-autospace:;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1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월 분당에서</span></p><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ms-text-autospace:;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손 최순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崔順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삼가 씀</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각주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7)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석형</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李石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15~1477)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연안이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백옥</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白玉</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저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樗軒</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문종 때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고려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개찬에 참여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문장</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글씨에 능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8)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경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李景奭</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595~1671)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전주이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상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尙輔</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백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白軒</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청나라의 침략 위기에서 큰 공을 세웠으나</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삼전도 비문 작성 같은 현실적인 자세가 비판받았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9)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李植</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584~1647)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덕수이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여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汝固</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택당</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澤堂</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남궁외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南宮外史</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택구거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澤&#30319;居士</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당대의 이름난 학자로서 한문</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단하</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李端夏</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625~1689)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덕수이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계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季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외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畏齋</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송간</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松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홍문관 제학으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현종개수실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편찬에 참여하였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예조 판서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사창절목</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선묘보감</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을 찬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저서에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외재집</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 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1)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창협</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昌協</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651~1708)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안동김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중화</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仲和</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농암</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農巖</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수항</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壽恒</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의 아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녹동서원에 배향되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2)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김진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金鎭商</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684~1755) :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광산김씨</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자 여익</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汝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호 퇴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退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신임사화로 무산에 유배되었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영조 때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mso-fareast-font-family: 굴림;">글씨에 뛰어나 많은 비문을 썼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br></p>
<!-- -->
카페 게시글
연촌유사
서 문
여수
추천 0
조회 101
19.05.07 05:4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