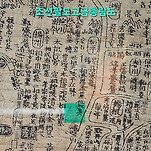<p><b><span>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② - 1 임윤원 에 이어서</span></b></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71. 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임자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19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5</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左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右承旨<span style="color: #007600;">洪&#29851;</span>, 左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許玧</span>, 右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李徵龜</span>, 同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權尙游</span>上疏。大槪, 臣等, 於朝者嚴批之下, 不敢晏然榮次, 冒死自列, 乞遞臣等之職, 仍治妄言之罪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等勿辭察職。</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승지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우승지 홍숙</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洪 &#2985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부승지 허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許玧</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우부승지 이징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徵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동부승지 권상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權尙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가 상소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개 신들은 아침에 엄한 비답이 내려진 상황에서 감히 태연히 영화로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스스로 논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論列</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들의 직임을 체차하고 이어 망언한 죄를 다스리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답하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대들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참고: 왕조실록 숙종 31년 1월 16일 기록)</p><p>대사헌(大司憲) 송상기(宋相琦)가 상소하기를,</p><p>“저으기 보건대, 요즈음 간신(諫臣)의 한 상소 때문에 풍파(風波)가 크게 일어나 국사(國事)가 어지럽게 분열되었으니, 신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직임이 간장(諫長)이니 어찌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다투며 떠드는 것을 신은 실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간신(諫臣)의 상소에서는 오로지 전조(銓曹)와&#160;기백(畿伯)을 공격하였는데, 전조의 경우는 대신이 배척을 당한 것을 스스로 논열(論列)했습니다. 그런데 신은 대신에게 이미 친혐(親嫌)이 있고, 기백(畿伯) 또한 인척(姻戚)으로 연결된 사이이니, 그가의 가부(可否)와 시비(是非)는 모두 신이 참여해 의논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독 성상(聖上)의 처분(處分)에서 감히 알지 못할 바가 있기에 감히 이렇게 대략 진달합니다.</p><p>대개 요즈음 전관(銓官)들이 불분명한 시기를 당하여 반드시 다투어야만 할 처지에 처하고 있다면 그들이 패배를 당한다는 것은 형세상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신(諫臣)이 전관(銓官)을 논죄(論罪)하면서 방자하게 꺼리낌이 없다는 것으로 죄안(罪案)을 만드는 데 이르렀으니, 인신(人臣)으로 이런 죄명(罪名)을 지고서 주벌(誅罰)을 면할 수 있었던 것만도 다행스럽다 할 것입니다. 어찌 감히 하룬들 직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殿下)께서 만일 간신(諫臣)의 말이 속이는 데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견책과 물리침을 내려 국법(國法)을 바로잡으소서.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역시 마땅히 통쾌하게 용서를 내려 시비(是非)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하면서&#160;개정(開政)하는 명이 여러 번 내려지고 한 번 패초(牌招)하고 두 번 패초하면서 불러들이기를 청하는 거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저 전관(銓官)들이 당한 처지가 어떠합니까? 그러니 실정과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명을 받들 리가 있겠습니까? 사체(事體)의 손상(損傷)은 진실로 말할 것도 없겠지만, 성명(聖明)께서 신하를 대우하심도 역시 정성스럽지 못한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동언(李東彦) 등의 일을 당초에 성명(聖明)의 특명으로&#160;치대(置對)하도록 한 것은 대개 대간(臺諫)에서 아뢴 것을 반드시 모두 믿지 못하여 허위와 실상을 알아서 처리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사를 행하여 아뢰고 성상의 재결을 우러러 품지함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분간(分揀)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으니, 성상의 의도(意圖)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분간하라는 영(令)이 내려졌다면 그 죄는 저절로 신설(伸雪)하는 데로 돌아갈 것이며, 대간에서 아뢴 것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것도 따라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남에게 가하였다가 일이 마침내 사실무근임이 드러나면 논의를 발설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굳게 막은 것은 정도에 지나친다고 하교하시고 이동언(李東彦)의 경우는 오랫동안 은점(恩點)을 아껴 다시 거두어다 녹용(錄用)하지 않아서 애당초 분간하라는 뜻과 같지 않은 바가 있는 것은 또한 무슨 까닭입니까? 그리고 대저 전관(銓官)의 뜻 또한 어찌 조태억(趙泰億)을 영원히 버려두고 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옛날의 경력(經歷)에 조금 구애되므로 조금이라도 정체(政體)를 보존시키려고 간략하게 경고와 책망을 베풀어 경박하게 떠드는 것을 억제시키려 한 것인데, 역량(力量)을 갖추지 못하여 인순(因循)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일부러 폐고(廢錮)시키려는 의도이겠습니까?</p><p>요즈음 세도(世道)가 크게 무너지고 과격하게 들추어내는 것이 풍습을 이루어 티끌만큼이라도 혐의가 있고 색목(色目)이 조금만 다르면 문득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악명(惡名)을 씌우는데, 말하는 자도 어렵게 여김이 없고 듣는 사람도 듣기를 좋아하여 같은 소리로 서로 응하기를 마치 한 입에서 나온 듯하니, 이것이 어찌 성실 충후(忠厚)하고 공평한 도리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밝히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말하기를, ‘이것은 사정(私情)이며, 이것은 당론(黨論)이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여러 신하들은 전하(殿下)께서 평소에 친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으니, 비록 힘써 공도(公道)를 넓혀 성상의 뜻에 보답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찌 공공연하게 멋대로 속이고 가리며 자기의 속셈을 방자하게 행하기를 발언(發言)한 사람의 말과 같이 하는 데 이르겠습니까?</p><p>하늘의 감시는 매우 밝습니다. 진실로 스스로 공론(公論)이라고 일컬으면서 뜻은 불화를 만드는 데 두고 번번이 말하기를, ‘당론(黨論)이다.’고 하면서도 자취가 서로 질투하고 비방하는 데 관계되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엄중하게 억제하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어 진정(鎭定)시키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바야흐로 일어나는 의논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더 기이해져 조정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고 국사(國事)가 잘 될 희망이 없을 듯합니다. 시국의 형상을 직접 보고서 깊이 걱정하며 길게 탄식하느라 밤중에도 잠을 이룰 수 없어 천박한 소견을 대략 진달합니다.”</p><p>하니 답하기를,</p><p>“방자하다는 배척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호하며 구원한다는 말 또한 온당(穩當)하지 못하다. 다만, 의논을 발설한 사람이라도 굳게 막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소에 대한 비답에다 약간 언급하였던 것이다. 지금 이동언에 대하여 오래도록 은점(恩點)을 아꼈다는 것으로 상시(嘗試)하는 뜻이 현저히 있는데, 나는 실로 깨닫지 못하겠다.”</p><p>하였다. 이튿날 <u>승정원</u><u>(</u><u>承政院</u><u>)</u><u>에서</u><u>&#160;</u><u>복역</u><u>(</u><u>覆逆</u><u>)&#160;</u><u><span style="color: #150567;">【</span></u><u><span style="color: #150567;">승지</span></u><u><span style="color: #150567;">(</span></u><u><span style="color: #150567;">承旨</span></u><u><span style="color: #150567;">) </span></u><u><span style="color: #0000ff;">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0000ff;">(</span></u><u><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u><u><span style="color: #0000ff;">)</span></u><u><span style="color: #150567;">ㆍ</span></u><u><span style="color: #150567;">홍숙</span></u><u><span style="color: #150567;">(</span></u><u><span style="color: #150567;">洪&#29851;</span></u><u><span style="color: #150567;">)</span></u><u><span style="color: #150567;">ㆍ</span></u><u><span style="color: #150567;">허윤</span></u><u><span style="color: #150567;">(</span></u><u><span style="color: #150567;">許玧</span></u><u><span style="color: #150567;">)</span></u><u><span style="color: #150567;">ㆍ</span></u><u><span style="color: #150567;">이징귀</span></u><u><span style="color: #150567;">(</span></u><u><span style="color: #150567;">李徵龜</span></u><u><span style="color: #150567;">)</span></u><u><span style="color: #150567;">ㆍ</span></u><u><span style="color: #150567;">권상유</span></u><u><span style="color: #150567;">(</span></u><u><span style="color: #150567;">權尙游</span></u><u><span style="color: #150567;">)</span></u><u><span style="color: #150567;">이다</span></u><u><span style="color: #150567;">.</span></u><u><span style="color: #150567;">】</span></u><u>&#160;</u><u>하기를</u><u>,</u></p><p>“대개 이른바 상시(嘗試)란 것은 속으로 감춘 것이 있으면서 겉으로 쓸모없는 말을 핑계대어 인주(人主)의 마음을 탐지(探知)하여 적당히 행동하는 자의 하는 짓입니다. 지금 송상기(宋相琦)는 이동언(李東彦)에게 오래도록 은점(恩點)을 아낀다는 것으로 바로 그 일을 들어 성실하게 말하였으니, 이 경우 그 말이 어찌 조금이라도 상시(嘗試)에 근사(近似)한 것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실정 밖의 하교를 일을 말한 헌장(憲長)에게 가하였으니 실로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성덕(盛德)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세 번 생각을 더하시어 빨리 거두어 들이도록 명하소서.”</p><p>하니 답하기를,</p><p>“송상기가 상소한 가운데 이미 지난날 분간(分揀)하도록 한 하교를 거론하고, 잇달아 이동언(李東彦)에게 오랫동안 은점(恩點)을 아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고 하며 윗사람의 뜻을 탐지하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상시(嘗試)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대들은 서둘러서 고치기를 청하는데 의도가 가리워서 숨기려는 데 있으니, 무엄하다고 할 만하다. 마음대로 하도록 하라.”</p><p>하였다.</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72. 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병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3/17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5</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24</span></p><p>左副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上疏。大槪, 臣情勢危蹙, 疾病且重, 而近緣院僚之不備, &#40701;勉供仕矣。自昨日, 症情一倍添劇, 達夜痛苦, 有若頃刻垂盡者, 乞遞臣職, 以尋生路事。入啓。遞差。</p><p>&#160;</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부승지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상소하였다</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개 신은 정세가 위태롭고 질병도 위중한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근래 본원의 동료 관원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어제부터 증세가 한층 더 심해져 밤새도록 고통으로 신음하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하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살길을 찾게 해 주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체차하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73. 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9</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계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1/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5</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160;明日監試·覆試, 一所試官二,&#160;<span style="color: #007600;">姜&#37607;</span>·<span style="color: #007600;">李光迪</span>, 參試官三,&#160;<span style="color: #007600;">權持</span>·<span style="color: #0000ff;">任&#22469;</span>·<span style="color: #007600;">李大成</span>。二所試官二,&#160;<span style="color: #007600;">閔鎭厚</span>·<span style="color: #007600;">金鎭圭</span>, 參試官三,&#160;<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7600;">洪泳</span>·<span style="color: #007600;">申&#37908;</span>。</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내일 감시 복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監試覆試</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 일소 시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一所試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은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개이고 강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姜 &#3760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과 이광적</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光迪</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u><span data-ke-size="size18">참시관</span></u><u><span data-ke-size="size18">(</span></u><u><span data-ke-size="size18">參試官</span></u><u><span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은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3</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권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權持</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방</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 &#22469;</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대성</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大成</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소 시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二所試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두 자리에 민진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閔鎭厚</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ㆍ</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김진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金鎭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u><span data-ke-size="size18">참시관</span></u><u><span data-ke-size="size18">(</span></u><u><span data-ke-size="size18">參試官</span></u><u><span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자리에</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 <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ㆍ</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홍영</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洪泳</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ㆍ</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申 &#3790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차하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74. 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정유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4/2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5</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左承旨<span style="color: #007600;">南致熏</span>, 右承旨<span style="color: #007600;">趙泰東</span>, 左副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右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金致龍</span>上疏。大槪, 臣等旣被<span style="color: #007600;">靈愼君瀅</span>之疏斥, 決不可一刻晏然, 適値大禮, 今始露章自列, 乞遞臣等之職, 以安私分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等勿辭察職。</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승지 남치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南致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우승지 조태동</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趙泰東</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부승지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우부승지 김치룡</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金致龍</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소하였다</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개 신들이 영신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靈愼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 상소에서 배척을 당한 것은 결코 잠시도 태연히 있을 수 없는데 마침 대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大禮</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를 만나 지금에서야 상소하여 스스로 논열하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들의 직임을 체차하여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답하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대들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75. 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경술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9/11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5</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25</span></p><p>&#160;右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上疏。大槪, 臣積傷之餘, 重得寒感, 委身牀席, 晝夜叫痛, 旬望之間, 萬無復起爲人之望, 喉司緊任, 不可曠日虛帶, 乞遞職名, 以尋生路事。入啓。</p><p>&#160;</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우승지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상소하였다</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개 신은 오랫동안 몸이 상한 나머지 감기에 심하게 걸려 병석에 몸져누워 밤낮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열흘이나 보름 사이에 다시 일어나 사람 노릇을 할 가망이 전혀 없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승정원의 긴요한 직임을 시일만 보내며 헛되이 맡고 있을 수 없으므로 직명을 체차하여 살길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76. 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병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0/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5</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160;明日式年東堂文科會試, 試官三,&#160;<span style="color: #007600;">李光迪</span>·<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7600;">許玧</span>, 參試官四,&#160;<span style="color: #007600;">柳龜徵</span>·<span style="color: #007600;">尹憲柱</span>·<span style="color: #007600;">呂必重</span>·<span style="color: #007600;">申&#37908;</span>。</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내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식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式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태세</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太歲</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즉 해의 간지에 자</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子</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ㆍ</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오</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午</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ㆍ</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묘</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卯</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ㆍ</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유</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酉</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가 드는 해로</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 3</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동당 문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東堂文科</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회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會試</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u><span data-ke-size="size18">시관</span></u><u><span data-ke-size="size18">(</span></u><u><span data-ke-size="size18">試官</span></u><u><span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시험감독관</span></u><u><span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은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3</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광적</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光迪</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허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許玧</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참시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參試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시험 부감독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유귀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柳龜徵</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윤헌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尹憲柱</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여필중</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呂必重</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申 &#3790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77. 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윤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병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6/10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5</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都承旨<span style="color: #007600;">黃欽</span>, 左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左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金萬埰</span>, 右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許玧</span>, 同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金相稷</span>上疏。大槪, 臣等於憲臣之疏, 有不敢晏然者, 乞遞臣等之職, 以重臺議, 以安微分事。入啓。答曰, 省疏具悉。卿等勿辭察職。</p><p>&#160;</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도승지 황흠</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승지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부승지 김만채</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우부승지 허윤</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동부승지 김상직이 상소하였다</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개 신들이 헌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憲臣</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 상소에 대해 감히 태연히 있을 수 없는 점이 있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들의 직임을 체차하여 대간의 의론을 중시하고 미천한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답하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경들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78. 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윤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정사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5</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左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左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金萬埰</span>, 右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許玧</span>上疏。大槪, 臣等於該房問備之命, 有不可晏然於職次者, 乞賜遞改, 以安私分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等勿辭察職。</p><p>&#160;</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승지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부승지 김만채</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金萬埰</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우부승지 허윤</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許玧</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상소하였다</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개 신들은 해당</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방</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房</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 문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問備</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죄상 심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라는 명에 대해 직차</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職次</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편안히 있을 수 없는 점이 있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체차하여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답하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대들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79. 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2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경술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5</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60;&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하사품</span></p><p>備忘記, 金寶篆文書寫官參判<span style="color: #007600;">金鎭圭</span>·金寶及寶朱匣內入時左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任胤元</span>, 各熟馬一匹。記事官<span style="color: #007600;">李禎億</span>, 假注書<span style="color: #007600;">洪尙賓</span>, 金寶差備官正郞<span style="color: #007600;">姜&#26983;</span>, 佐郞<span style="color: #007600;">李奎年</span>, 各兒馬一匹賜給。<span style="color: #2eb100;">宗廟</span>一室寶匣差備官正郞<span style="color: #007600;">尹扶</span>以下及<span style="color: #2eb100;">永寧殿</span>六室寶匣差備官守<span style="color: #007600;">南宅夏</span>以下及禮貌官等, 各加一資, 資窮者代加。</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비망기에</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금보전문 서사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金寶篆文書寫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인 참판 김진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金鎭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금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金寶</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및 보주갑</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寶朱匣</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대내에 들일 때 좌부승지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게 각각 숙마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필을 사급하라고 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기사관 이정억</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禎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가주서 홍상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洪尙賓</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금보 차비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金寶差備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인 정랑 강영</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姜 &#2698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랑 이규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奎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게 각각 아마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필을 사급하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종묘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실의 보갑 차비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寶匣差備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인 정랑 윤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尹扶</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하와 영녕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永寧殿</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실의 보갑</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寶匣</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차비관 남택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南宅夏</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하 및 예모관 등에게 각각 한 자급을 가자하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자궁</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資窮</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代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80. 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2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무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10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5</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26</span></p><p>左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u>三度呈辭</u>。入啓。遞差。</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승지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세 번째 정사를 올렸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체차하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81. 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2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9</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기사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7/11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5</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하사품</span></p><p>備忘記, 金寶篆文書寫官參判金鎭圭, 都承旨李震休, 府使尹德駿, 副司果李徵夏, 副正趙泰基, 翊贊金昌國, 金寶及寶朱匣內入時, 左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右承旨許&#22656;, 各熟馬一匹, 記事官李縡·李禎億, 假注書崔宗周·洪尙賓·金寶差備官直講李景華, 主簿黃鍍正·柳鳳徵, 典籍鄭翊時, 佐郞李衡佐, 主簿金混·李廷晳, 佐郞黃夏弼·鄭一寧·尹志源, 正郞李鼎華, 主簿徐夢良, 令李齊尙, 正郞申處華·尹世緯·洪禹鼎·曺廷善, 佐郞朴始采, 正郞姜&#26983;, 佐郞李奎年, 各兒馬一匹賜給。</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비망기에</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금보전문 서사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金寶篆文書寫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김진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金鎭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도승지 이진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震休</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등</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금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金寶</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및 보주갑</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寶朱匣</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대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大內</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들일 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승지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우승지 허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許 &#2265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게 </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각각 숙마</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熟馬</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1</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필</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기사관 이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縡</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822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등</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금보갑 차비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金寶差備差備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인 직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直講</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경화</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景華</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등에게 </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각각 아마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필을 사급하라</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82. 6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경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8/21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6</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左副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同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朴弼明</span>上疏。大槪, 臣於判金吾之箚, 有不敢晏然者, 乞罷臣等之職, 仍治失體之罪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等勿辭察職。</p><p>&#160;</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부승지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과 동부승지 박필명</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朴弼明</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상소하였다</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개 신이 판의금부사의 차자에 대해 감히 태연히 있을 수 없는 점이 있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들의 직임을 파직하시고 이어 체모를 잃은 죄를 다스리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답하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대들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83. 6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임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7/19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6</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左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同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朴弼明</span>上疏。大槪, 臣等於大臣箚辭, 有不敢仍冒者, 乞罷臣等之職, 仍治臣等之罪, 以安微分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等勿辭察職。</p><p>&#160;</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승지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과 동부승지 박필명</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朴弼明</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상소하였다</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개 신들이 대신이 올린 차자의 내용에 감히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없는 점이 있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들의 직임을 파직하시고 이어 신들의 죄를 다스려 미천한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답하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대들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84. 6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무신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16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6</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27</span></p><p>左承旨<span style="color: #007600;">任胤元</span>三度呈辭。入啓。遞差。</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승지 임윤원</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세 번째 정사를 올렸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체차하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85. 6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9</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임오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4/2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6</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左承旨<span style="color: #007600;">兪命雄</span>, 右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左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金弘楨</span>, 右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李晩成</span>, 同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南就明</span>上疏。大槪, 臣等於臺臣之疏斥, 有不敢晏然於職次者, 乞遞臣等之職, 以安私分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等勿辭職。</p><p>&#160;</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승지에 유명웅</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兪命雄</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우승지에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부승지 김홍정</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우부승지 이만성</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동부승지 남취명의 상소를 올렸다</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개 신들은 대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臺臣</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상소하여 배척한 것에 대해 감히 직차</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職次</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편안히 있을 수 없는 점이 있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들의 직임을 체차하여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답하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대들은 사직하지 말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참고: 서원등록 숙종 32년 10월 30일 기록<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을지문덕</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乙支文德</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과 최윤덕</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崔潤德</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ㆍ</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이원익</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李元翼</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ㆍ</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김덕함</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金德&#35572;</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을 모신 서원에 특별히 편액을 하사하는 건</span><span style="color: #232427;" data-ke-size="size14">)</span></p><p>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평안도(平安道)의 생원(生員) 김세기(金世機) 등의 상소를 보니, ‘옛날 고구려(高句麗) 때 대신(大臣) 을지문덕(乙支文德)은 문장(文章)과 무략(武略)이 모두 뛰어났는데, 그가 지은 시 구절이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학문이 설총(薛聰)ㆍ최치원(崔致遠)보다 먼저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 양제(隋煬帝)가 천하의 병력을 징발하여 요동(遙東)을 향해 진군할 때, 압수(鴨水)와 향산(香山)이 이전에 고려(高麗) 임금의 소유였으므로 평양(平壤)의 위급함이, 조석(朝夕) 간에 함락 직전에 놓였던 한단(邯鄲)보다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지문덕이 안으로 전쟁과 수비의 도구를 준비하고 밖으로 기변(機變)의 계책을 세운 다음 거짓으로 패배한 척하며 적군을 유인하였다가 군사를 풀어 급히 공격하니, 수나라 군사가 전부 패하고 여러 장수가 도망쳐 돌아갔는데, 그때 우문술(宇文述) 등의 30만 병력 중에 생존한 자가 3천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동방이 개국(開國)한 이래 이러한 승첩(勝捷)은 없었으니, 그의 풍성하고도 위대한 공렬(功烈)이 찬란히 빛나 수천 년 이래로 마치 전날의 일처럼 생생하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이곳 청천(淸川)은 바로 을지문덕이 공로를 수립한 지역입니다. 청천강의 남쪽 언덕에 돌 한 조각이 서있는데 고로(古老)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장군의 석상(石像)이라 하였고, 또 폐허가 된 집터 몇 칸이 있는데 이 역시 장군의 사당이라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너나없이 공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적이 잡초가 우거져 매몰되었으니, 노상의 행인이 혀를 차며 상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멀리 궁벽한 곳에 떨어져 있으므로 마음속으로 개연(慨然)히 느낀 나머지 장군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안을 모색하여 수십 년 전에 본주(本州)의 성남(城南)에다 사당을 새로 지어 장군의 영령(英靈)을 봉안하고 이어서 고(故)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최윤덕(崔潤德), 영의정(領議政) 문충공(文忠公) 이원익(李元翼), 대사헌(大司憲) 김덕함(金德&#35572;)을 모두 배향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큰 선비이고, 세 신하는 성조(聖朝)의 어진 보필이었는데, 서로 잇따라 본주(本州)에 부임하여 나란히 방명(芳名)과 미덕(美德)을 남기었으므로 우매한 백성이나 지혜로운 백성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부모처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道內)에 뜻을 같이 한 선비들이 함께 재력(財力)을 모아 이미 사당을 건립하여 사현(四賢)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삼고, 이어 재실(齋室)을 지어서 제생(諸生)들이 학업을 익히는 곳으로 삼은 다음 발을 싸매고 달려와서 먼 곳의 기대를 부응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을지문덕이 수립한 공렬이 전 고구려조에 드높이 드러나 사책(史冊)에까지 기록되어, 지금 서쪽 지방의 백성들이 칭송하는 바가 과연 김세기 등이 상소에서 밝힌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조(本朝)의 세 신하는 본토(本土)에 부임하였는데, 그 청조(淸操)와 선정(善政)을 그 지방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원익과 김덕함은 비록 다른 곳의 서원에 배향되어 있으나 단독으로 배향한 것이 아니므로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한 것과 다르니, 마땅히 일체로 허락하여 먼 지방 사민(士民)의 여망을 위로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은전(恩典)에 관계된 일므로 신(臣)의 조(曹)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임금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45년 10월 13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span style="color: #0000ff;">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이 담당하였는데, 특별히 편액을 하사하라고 계하(啓下)하였다.</p><p>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판하(判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교서(敎書)와 액호(額號)를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짓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86. 6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기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26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6</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28</span></p><p>左承旨<span style="color: #007600;">任胤元</span>初度呈辭。入啓。給由。</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승지 임윤원</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첫 번째 정사를 올렸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말미를 주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87. 61세 &lt;<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신유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11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6</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29</span></p><p>左承旨<span style="color: #007600;">任胤元</span>再度呈辭。入啓。加給由。</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승지 임윤원</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두 번째 정사를 올렸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말미를 더 주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88. 6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임술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0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6</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30</span></p><p>左承旨<span style="color: #007600;">任胤元</span>三度呈辭。入啓。遞差。</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좌승지 임윤원</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세 번째 정사를 올렸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체차하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18">89. 61세</span> &lt;<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무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1/26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6</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大司諫<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啓曰, 臣於秋間, &#24541;&#21480;本職, 迫於嚴召, &#40701;勉出肅, 仍參於鞫坐矣。日昨憲臣疏中, 盛陳鞫獄之不遵法例, 而語意甚峻, 臣於是不勝瞿然之至。臣旣以諫職, 進詣鞫廳, 至於三日, 而完議之際, 亦皆同參, 則當此參鞫諸臣待罪之日, 不可晏然於言地, 而況今鞫獄再設之時, 臣以旣參初鞫之人, 自以爲我無所失, 而冒沒隨參, 寧有是理? 士夫廉隅爲重, 雖被重譴, 斷不可參鞫。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p><p>&#160;</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사간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이 가을에 외람되이 본직을 맡아 엄한 소명에 쫓겨 마지못해 나와 숙배하고 이어 국청의 좌기에 참석하였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일전에 헌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憲臣</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상소에서 국옥</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鞫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법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法例</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극력 아뢰었는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말뜻이 매우 준엄하여 신은 이에 지극히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이 이미 간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諫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으로서 국청에 나아간 지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일이 되었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논을 완료할 때에도 모두 동참하였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렇게 국청에 참석하는 여러 신하가 대죄하고 있는 때에 언관의 자리에 태연히 있을 수 없는 데다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더구나 지금 국옥</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鞫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재차 설행하는 때에 신이 이미 처음 국청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여겨서 염치를 무릅쓰고 따라서 참여하였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사대부의 염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廉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는 중요하니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엄한 견책을 받더라도 결단코 국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답하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物論</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기다리라고 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90. 6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무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4/26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6</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160;政院啓曰, 鞫廳將爲開坐, 而兩司不可不備員, 而諫院之官, 正言<span style="color: #007600;">沈宅賢</span>牌不進, 罷職傳旨, 才已捧入, 大司諫<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以當初參鞫, 重被憲臣疏斥, 亦爲引避。獻納<span style="color: #007600;">李宜顯</span>, 承牌後旋卽呈辭出去。他無在京推移之員。獻納<span style="color: #007600;">李宜顯</span>, 更卽牌招, 以爲進參之地, 何如? 傳曰, 允。</p><p>&#160;</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정원에서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국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鞫廳</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좌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坐起</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를 열려고 하는데 양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兩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 인원을 갖추지 않을 수 없는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간원의 관원과 정언 심택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沈宅賢</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패초에 나오지 않아 파직하라는 전지를 방금 봉입하였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사간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은 당초 국청에 참석하느라 거듭 헌신</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憲臣</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 배척을 받았으므로 또한 인피하였습니다</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헌납 이의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宜顯</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패초를 받든 뒤에 곧바로 정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呈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고 나갔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달리 서울에 있는 변통할 인원이 없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헌납 이의현을 다시 즉시 패초하여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참고:승정원일기 433책 (탈초본 23책) 숙종 32년 11월 24일)</p><p>獻納李宜顯啓曰, 今此鞫事, 乃是更鞫凶溥等之獄, 則臣之不可參涉, 較然甚明。且大司諫任胤元, 引避退待, 處置歸於臣身, 而其所引嫌, 亦以頃日傳獄按問時事, 則臣尤何敢可否於其間乎? 踪跡之&#32613;&#31001;, 觸處如許, 其不可冒據也, 於是乎決矣。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p><p><u>헌납 이의현이 아뢰기를</u>, -중략-이번 국청의 일은 바로 흉적 황부(黃溥) 등의 옥사를 다시 국문하는 것이니 신이 참여할 수 없음이 너무도 분명합니다.또 대사간 <span style="color: #0000ff;">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이 인피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어 처치하는 일이 신에게 돌아왔는데, <u>그가 인혐한 바도 지난날 전옥</u><u>(</u><u>傳獄</u><u>) </u><u>한 때의 일을 가지고 신문했을 때의 일</u>로 신이 더욱 어찌 감히 그 사이에서 가타부타할 수 있겠습니까.종적이 구애되는 것이 도처에 이와 같으니 함부로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에서 분명합니다.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라고 하였다.</p><p>&#160;</p><p>(참고:승정원일기 433책 (탈초본 23책) 숙종 32년 11월 25일)</p><p>府啓, 請還收蔘貨行商之命事。竝引嫌而退, 憲臣疏語, 旣出泛論, 因此引避, 殊涉太過, 嫌難參涉, 其勢固然, 請大司諫任胤元, 獻納李宜顯, 竝命出仕事。入啓。不允。處置事, 依啓。</p><p>사헌부가 삼화(蔘貨)를 행상하라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는 일로 아뢰었다.모두 인혐하고 물러났는데, 헌신(憲臣)이 올린 상소의 말은 이미 범범하게 논한 데에서 나온 것인데 이로 인하여 인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니, 혐의스러워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그 형세가 본디 그러하니, 대사간 <span style="color: #0000ff;">임윤원</span>과 헌납 이의현을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입계하였다.윤허하지 않는다.처치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91. 6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정해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13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6</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31</span></p><p>大司諫<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u>三度呈辭</u>。入啓。遞差。</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사간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세 번째 정사를 올렸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체차하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92. 6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기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6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7</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傳曰, 奠幣瓚爵官<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拿推。</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전교하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전폐찬작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奠幣瓚爵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제례의식의 집사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나추</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拿推</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죄상을 추문함</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라고 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93. 6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9</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신축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5/12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7</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大司諫<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啓曰, 臣&#24541;&#21480;本職之後, 試事爲急, 不敢辭避, 承牌出肅, 仍詣於重試武所, 又參於太廟親祭時陪從之列。素患風痺之症, 一倍添重, 尋單累日, 不得行公矣。卽伏見持平<span style="color: #007600;">韓祉</span>疏本, 則盛言銓官之只以門閥循例通淸, 而臺官之不度才具, 循例行公, 大加譏斥。此雖非專指臣身而發, 臣於前後, 不能自&#25571;, 冒沒行公, 非止一再, 則慙&#24679;之懷, 臣亦有之, 其何可一刻仍冒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p><p>&#160;</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사간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이 외람되이 본직을 맡은 뒤에 시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試事</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가 급하므로 감히 사퇴하지 못하고 패초를 받들어 나와 숙배하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어 중시 무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重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나아가 </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태묘</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太廟</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 친제 때 배종</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는 반열에 참석하였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평소 앓던 풍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風痺</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증세가 배나 더 심해져서 단자를 올린 지 여러 날이 되었으므로 공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방금 삼가 지평 한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韓祉</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 소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疏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보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전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銓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단지 문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門閥</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로 규례에 따라 통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通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한다고 장황하게 말하였는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대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臺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재주를 헤아리지 않고 규례에 따라 공무를 행하여 크게 비난하였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것이 비록 신을 전적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이 전후로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염치를 무릅쓰고 공무를 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부끄러운 마음이 신에게도 있는데 어찌 잠시라도 대차</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臺次</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답하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物論</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기다리라고 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18">94. 62세</span> &lt;<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병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12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7</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32</span></p><p>大司諫<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u>三度呈辭</u>。入啓。遞差。</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사간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세 번째 정사를 올렸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체차하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95. 6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3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9</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신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6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7</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今戊子式年, 東堂試官帶軍銜下鄕人員罷職現告, 護軍<span style="color: #007600;">徐宗憲</span>·<span style="color: #007600;">金弘楨</span>·<span style="color: #007600;">李海朝</span>·<span style="color: #007600;">孟萬澤</span>·<span style="color: #007600;">李徵龜</span>·<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번 무자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식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式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동당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東堂試</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시험장의 별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시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試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으로서 군함</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軍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군사에 관한 직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띠고 고향에 내려갔던 인원을 파직하는 것으로 현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現告</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였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호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護軍</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五衛</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에 속한 정사품 관직</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서종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徐宗憲</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2539;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김홍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金弘楨</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2539;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해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海朝</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2539;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맹만택</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孟萬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2539;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징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徵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2539;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96. 6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4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을유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5/12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8</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33</span></p><p>&#160;刑曹參議<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u>三度呈辭</u>。入啓。遞差。</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형조 참의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세 번째 정사를 올렸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체차하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97. 6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4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계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5/17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09</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判決事<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span style="color: #2eb100;">廣州</span>地掃墳呈辭。入啓。給由。</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판결사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광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廣州</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성묘를 하기 위해 정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呈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말미를 주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98. 6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5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을축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8/20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1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王世子</span><span style="color: #ff0000;">가 칭상상수</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稱觴上壽</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장수를 바라는 마음</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하는 </span><span style="color: #ff0000;">禮</span><span style="color: #ff0000;">를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span></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중략</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曰, 今番疾候, 非如前時, 累朔沈淹, 上下焦煎, 幸賴宗社之福, 今已底安, 告廟設科, 次第擧行, 而王世子進宴一款, 非但朝廷之意如此, 閭巷婦孺, 亦皆&#38994;望, 今若不賜允許, 則王世子缺然之情, 當復如何? 在庭臣僚, 孰不欲仰達當行之意, 而大臣有故, 尙未稟定, 宗臣之疏, 不得蒙允, 禮官陳請, 終未回聽, 群情極以爲抑鬱矣。上曰, 當初告廟陳賀, 已爲不安, 而禮官喉司, 相繼陳請, 不得已允從, 至於進宴, 則決不可行, 宗臣疏批, 禮官草記, 已示予意, 終不可允從矣。</p><p>&#160;</p><p><span data-ke-size="size18"><u>승지 </u><u><span style="color: #0000ff;">임윤원</span></u><u>이 아뢰기를</u>, 이번의 환후가 전과 같지 않아 여러 달 동안 앓아누워 있고 상하가 초조하게 애를 태웠는데 다행히 종사의 복에 힘입어 지금 이미 편안하였으니, 고묘(告廟) 하고 과거를 설행하는 것을 차례로 거행하되, 왕세자가 진연(進宴) 하는 한 가지 일은 조정의 뜻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여항의 아녀자도 모두 우러러 바라니, 지금 만약 윤허해 주지 않으신다면 왕세자의 서운한 마음이 다시 어떠하겠습니까.조정에 있는 신료들이 누구인들 마땅히 행하겠다는 뜻을 우러러 진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대신(大臣)이 사정이 있어 아직 여쭈어 정하지 못하였고, 종신(宗臣)의 상소는 윤허를 받지 못하여 예관(禮官)이 아뢰어 청하였으나 끝내 마음을 돌리지 못하여 사람들이 매우 답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u>상이 이르기를</u>, 당초 고묘(告廟) 하고 진하(陳賀) 하는 것이 이미 온당치 못한데 예관(禮官)과 승정원에서 서로 이어서 진청(陳請)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윤허하여 따라 주었고 진연의 경우는 결코 행할 수 없으며, 종신의 상소에 대한 비답과 예관의 초기에 이미 나의 뜻을 보였으니, 끝내 윤허할 수 없다.</span></p><p>-중략-</p><p>&#160;</p><p><span style="color: #0000ff;">胤元</span>曰, 聖意之沖謙, 臣等, 非不知之, 然而今玆之慶, 異於前日, 且以古事言之, 每於四仲月, 有進宴之例, 沙場閱武之後, 亦且行之, 自壬辰以後, 物力凋殘, 仍爲廢閣, 今日値此大慶, 豈可廢王世子稱觴上壽之擧乎? 卽今南中凶荒, 雖或以民事爲慮, 而進宴之時, 賑事將畢, 何可拘&#31001;小事, 而不爲之擧行乎? 臣民之情, 殊甚鬱抑矣。<span style="color: #007600;">姜&#37607;</span>曰, 以平人言之, 父母病&#30259;之後, 雖家甚貧, 必欲備酒饌, 會客團樂, 今當大慶, 豈可不爲少展王世子愛日之誠乎? 一國含生之類, 擧皆&#38994;望, 古云人欲天從, 更望特賜允從焉。</p><p>&#160;</p><p><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성상의 뜻이 충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沖厚</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다는 것을 신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번의 경사는 전날과 다르고 또 고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古事</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를 가지고 말하더라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매번 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중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仲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각 계절의 중간에 해당하는 달을 말한다</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음력으로 </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2</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월을 중춘</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仲春</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 5</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월을 중하</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仲夏</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 8</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월을 중추</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仲秋</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 11</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월을 중동</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仲冬</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이라고 불렀다</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각 계절이 시작하는 달은 맹월</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孟月</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끝나는 달을 만월</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晩月</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이라고 불렀다</span><span style="color: #444444;"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진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進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 예가 있고 사장</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沙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서 열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閱武</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한 뒤에도 행하는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임진년 이후로 물력이 조잔</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凋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고 그대로 폐기되어 있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오늘 이 큰 경사를 만났으니 어찌 왕세자가 잔을 올려 헌수하는 일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지금 남쪽 지방의 흉황</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凶荒</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비록 백성의 일을 염려하지만 진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進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때 진휼하는 일이 끝나려 하니 어찌 작은 일에 구애되어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민들의 마음은 매우 답답합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강현이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평범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부모가 병이 나은 뒤에는 비록 집이 매우 가난하더라도 반드시 술과 음식을 갖추고자 하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회객</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會客</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과 단락</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團樂</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은 지금 큰 경사를 만났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어찌 왕세자의 날짜를 아끼는 정성을 조금이나마 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 기대하고 있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였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다시 특별히 윤허하여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중략-</p><p>&#160;</p><p><span style="color: #0000ff;">胤元</span>曰, 前日進宴, 自上有敎, 從略爲之, 今番, 亦如前日之從略, 則財力不必多費矣。<span style="color: #007600;">姜&#37607;</span>曰, 其時器皿, 亦有外方進排, 今則皆仍舊用之, 費固不多, 而且但以義理言之, 何必盡念此等些弊乎?&#160;<span style="color: #0000ff;">胤元</span>曰, 外方之人皆以爲, 今番之慶, 孰有大於進宴之事, 不可不爲云? 王世子若終不行上壽之禮, 則其爲缺然, 何不盡達, 以聖上止慈之念, 何不念及於此乎? 上曰, 前日進宴, 極不安心, 世子陳請, 諸臣有言, 故萬分不得已特爲允從矣。今當艱虞之日, 決不宜再擧, 須勿强請。<span style="color: #007600;">姜&#37607;</span>曰, 臣等, 惶恐不敢更達而退, 群情必以爲鬱矣。若以夏間設行爲難, 則或待秋, 或從略, 不可終闕, 群下之至情如此, 幸須以體下之德, &#20127;賜允從焉。<span style="color: #007600;">胤元</span>曰, 今番則必與前事有異矣。上曰, 進退早晩, 非所言也。前事已極不安, 寧可再行? 予之本意如此矣。<span style="color: #007600;">姜&#37607;</span>曰, 祖宗朝故事, 或逐年爲之, 此非如無端游衍之比, 殿下只行一巡, 今番則應行之事, 又比前有加矣。上曰, 卿等之請, 雖出至情, 予亦有守, 決不可允從焉。</p><p>&#160;</p><p><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전날 진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進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성상께서 하교하셨는데 간략하게 하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번에도 전날처럼 간략하게 한다면 재력이 많이 소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강현이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 당시 기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器皿</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도 지방에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진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進排</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비용이 참으로 많지 않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또 의리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어찌 이런 사소한 폐단을 다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지방 사람들이 모두 이번의 경사가 진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進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는 일보다 큰 것이 없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왕세자가 끝내 상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上壽</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 예를 행하지 않는다면 서운함을 어찌 다 아뢰지 않겠으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자애로운 성상의 염려로 어찌 이 점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이 이르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전일 진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進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은 매우 마음이 편치 않아 세자가 진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陳請</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였는데 신하들이 말하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너무도 부득이하여 특별히 윤허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지금 어려운 시기에 결코 다시 거론해서는 안 되니 부디 억지로 청하지 말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강현이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들이 황공하여 감히 다시 아뢰지 못하고 물러가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사람들이 필시 답답하게 여길 것입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만약 여름에 설행하기 어렵다면 가을을 기다리거나 간략하게 하여 끝내 빠뜨릴 수 없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하들의 지극한 마음이 이와 같으니 부디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덕으로 속히 윤허하여 따라 주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번에는 필시 이전의 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이 이르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진퇴의 이르고 늦음은 말할 바가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전의 일이 이미 지극히 불안하였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어찌 다시 행할 수 있겠는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나의 본뜻은 이와 같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강현</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姜 &#37607;</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조종조의 고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故事</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를 해마다 행하기도 하는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는 무단으로 유세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전하께서 한 차례만 행하시고 이번에는 응당 행해야 할 일이 전보다 더합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이 이르기를</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 <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경들의 청이 비록 지극한 정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나도 지키는 바가 있으니 결코 윤허할 수 없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99. 6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5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을묘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1/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1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개 한 마리가 갑자기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武德門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안으로 뛰어들어왔던 일로 해서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守門軍卒</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의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從重決棍</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해당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守門將</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의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推考</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를 청하는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兵曹</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4">의 계</span></p><p>&#160;<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以兵曹言啓曰, 今四月二十日午時, 忽有逸狗, 自<span style="color: #2eb100;">武德門</span>入來, 直走內巡邏洞, 守門軍卒及近仗軍士等, 一時追逐, 至于<span style="color: #2eb100;">延和門</span>外執捉云, 事極驚駭。同門守門將, 常時不能檢飭之失, 在所難免, 守門軍卒, 自本曹從重決棍, 當該守門將, 推考, 何如? 傳曰, 允。</p><p>&#160;</p><p><u><span data-ke-size="size18">우부승지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오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2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일 오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午時</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갑자기 무덕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武德介</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가 무덕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武德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으로 들어와 곧장 내순동</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內巡洞</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으로 달려갔는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문을 지키는 군졸과 근장 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近仗軍士</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등이 일시에 뒤쫓아 가서 연화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延和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밖에 이르러 붙잡았다고 하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매우 놀라운 일입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동문의 수문장은 평상시 검칙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문을 지키는 군졸은 본조에서 엄하게 곤장을 치고</span> <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해당 수문장은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00. 6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5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경오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8/32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1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34</span></p><p>右副承旨<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疏, 伏以臣年迫七旬, 衰邁日甚, 夙夜之任, 決非所堪, 而何幸玉候康復, 宴禮將擧, &#24541;在近密, 慶&#24557;之心, 自倍於恒人, 不計筋力, 强勉供劇, 今已五箇月矣。自數日來, 重得外感, 渾身寒栗, 忽然昏窒, 多灌藥物, 僅得少甦, 而頭腦如破, 肢節如解, 壯熱升降, 頑痰壅滯, 上而嘔吐不止, 下而泄瀉無算, 飮啖全却, 晝夜叫苦, &#20725;臥直廬, 有若垂盡之狀, 急於調治, 不得不擔曳還家, 而顧此症情危惡, 實無旬望內差復之望, 出納重地, 不可久曠, 玆敢疾聲仰&#31858;於宸嚴之下。伏乞聖慈, &#20127;遞臣職, &#20478;尋生路, 千萬幸甚, 臣無任屛營祈懇之至。踏啓字。</p><p>&#160;</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우부승지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상소하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삼가 신은 나이가 칠순이 다 되어 노쇠함이 날로 심해져서 밤낮으로 근무하는 승지의 직임은 결코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닌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다행히 성상의 체후가 회복되어 연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宴禮</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를 거행하려고 성상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리에 있으면서 경축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하니 근력을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바쁜 업무를 수행한 지 지금 이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개월이 되었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수일부터는 거듭 외감</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外感</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걸려 온몸이 춥고 떨리면서 갑자기 정신이 혼미하고 숨이 막혀 약을 많이 먹어 겨우 소생할 수 있었으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머리는 깨지는 것처럼 아프고 사지의 관절은 풀리는 듯하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장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壯熱</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은 오르내리고 완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頑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은 꽉 막혔으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위로 구토가 멎지 않고 아래로는 설사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설사가 났으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기식</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氣息</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오락가락하여 실로 열흘 내에 회복할 가망이 없으니 출납</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出納</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는 것이 마치 거의 다 죽어 가는 상태인지라 출납</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出納</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는 것이 다급하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어쩔 수 없이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지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증세가 위독하여 실로 열흘 내에 회복될 가망이 없고 출납</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出納</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는 데에는 거의 다 죽어 갈 가망이 없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중요한 자리를 오래 비워 둘 수 없으므로 이에 감히 다급한 목소리로 성상께 우러러 호소합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살길을 찾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계자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啓字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찍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01. 6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5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신묘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2/25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1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160;又以禮曹言啓曰, 臣<span style="color: #0000ff;">胤元</span>, 與社稷署都提調行判中樞府事<span style="color: #007600;">李濡</span>, 進詣社壇, 昨日始役處, 更爲奉審, 則壇南邊&#30732;石九箇, 第二壇北邊&#30732;石三箇, 方欲毁撤, 而非但石理疎率, 片片缺落, &#30732;石內土築, 處處去缺, 此兩處, 雖或修補, 其餘壇石之出沒偏側, 未得平正者, 非止一二, 此由於歲久積漸之致, 觀其外面, 雖似無目前頹&#22318;之患, 而其中土築之去缺與否, 有未可知, 其在愼重之道, 設壇累百年, 到今擧全體一倂毁改, 實難輕議, 故當初奉審時, 只請就其尤甚處修改者, 蓋出於此, 而今以先毁處見之, 其所傷損如此, 則其他未毁處, 偏側不能平正者, 仍而置之, 亦不能無慮, 而社壇一倂改築之擧, 事禮極其重大, 諸大臣處問議後稟處, 似合事宜, 而旣毁&#30732;石, 則姑爲仍舊安排事, 分付, 何如? 傳曰, 允。</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예조참의</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윤원</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胤元</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span></u> <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사직서 도제조인 행 판중추부사 이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濡</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와 함께 </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사단</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社壇</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나아가</span></u> <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어제 역사를 시작할 곳을 다시 봉심해 보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단</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壇</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 남쪽 체석</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30732; 石</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9</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개와 제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단 북쪽 체석</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30732; 石</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3</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개가 이제 막 철거하려 하는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석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石理</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가 엉성하여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체석</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30732; 石</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안의 토석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土土築</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곳곳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두 곳은 비록 혹 보수하더라도 그 나머지 단석</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壇石</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편파적이고 편파적이어서 평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平正</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지 못한 것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체석</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30732; 石</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안의 토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土築</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곳곳에 떨어져 나간 것에 그치지 않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두 곳은 비록 혹 보수하더라도 그 나머지 단석</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壇石</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출몰하고 편파적으로 출몰하여 평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平正</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지 못한 경우는 그곳에 그치지 않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두 번째는</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는 세월이 오래되어 점점 쌓이는 결과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겉면을 보면 당장 무너지는 근심은 없을 듯하지만 그 가운데 흙을 쌓는 것이 없는지는 알 수 없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중을 기하는 도리로 볼 때 단 수백 년 동안에는 지금 전체의 전체를 모두 훼철하는 것은 실로 가벼이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봉심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다만 우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尤甚</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한 곳을 개수할 것을 청한 것은 대개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지금 먼저 무너진 곳을 보니 이와 같이 손상되었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 밖의 훼손되지 않은 곳이 편중되어 평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平正</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지 못한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또한 염려가 될 수 없지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사직단의 개축을 한꺼번에 개축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하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여러 대신에게 문의한 뒤에 품처하는 것이 사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事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합당할 듯하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미 훼철한 것은 우선 그대로 두고 안배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02. 6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5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을해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0/16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1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35</span></p><p>&#160;右承旨 <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上疏。大槪, 臣之脚病添劇, &#36332;步難運, 而此際召牌下降, 嚴畏分義, 曳到闕外, 而咫尺天陛, 無路入謝, 伏乞&#20127;遞臣職, &#20478;得安意調治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調理察職。</p><p>&#160;</p><p><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우승지 </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u><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상소하였다</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개 신의 다릿병이 더 심해져서 반걸음도 움직이기 어려운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러한 때에 소패</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召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가 내려와 신하로서의 도리가 두려워 몸을 이끌고 궐 밖에 이르렀으나 대궐을 지척에 두고도 들어가 사은할 길이 없으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삼가 바라건대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조리할 수 있게 해 주소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답하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03. 6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6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계해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4/36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12</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科擧</span><span style="color: #ff0000;">를 </span><span style="color: #ff0000;">設行</span><span style="color: #ff0000;">하는 장소와 시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span></p><p>臣昨因令禮兵官商審之命, 遣郞廳, 尺量<span style="color: #2eb100;">仁政殿</span>內外庭後, 與兵曹參議<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眼同尺量。<span style="color: #2eb100;">崇政殿</span>內外庭, 有所條錄, 請陳達其大槪。自<span style="color: #2eb100;">崇政殿</span>內庭, 至<span style="color: #2eb100;">廣達門</span>尺量, 則比諸<span style="color: #2eb100;">仁政殿</span>內外庭, 所縮二萬六千一百十六尺餘。自<span style="color: #2eb100;">崇政殿</span>內庭, 至<span style="color: #2eb100;">建明門</span>尺量, 則比<span style="color: #2eb100;">仁政殿</span>內外庭所剩六萬四百三尺餘矣。向日受灸時, 限以<span style="color: #2eb100;">廣達門</span>以上事稟定, 然則比<span style="color: #2eb100;">仁政殿</span>庭此多,&#160;<span style="color: #2eb100;">仁政殿</span>庭則平夷, 時御所則地勢傾仄, 且近來生齒漸繁, 而今此設科, 意在同慶, 故士子謂當如甲子·己卯之廣取, 遐方觀光之士, 必倍於前, 只許<span style="color: #2eb100;">廣達門</span>以上, 則決難容置矣。闕庭之內, 中間設圍作門, 事體未安。且旣許外庭, 則宜令多士, 無有蹂躪致傷之弊, 若以<span style="color: #2eb100;">建明門</span>以上爲限, 則似可容置矣。上曰, 以<span style="color: #2eb100;">建明門</span>爲限, 則比諸<span style="color: #2eb100;">昌德宮</span>內外庭, 尤加廣闊矣。<span style="color: #007600;">&#22698;</span>曰, 若限<span style="color: #2eb100;">建明門</span>以上, 則步數雖加, 而地勢傾仄, 故多士容入, 猶似未快足矣。鎭圭曰, 若限建明問以上, 則各司之在其內者, 可以變通。權移政院臺廳春坊等, 有南邊一路者, 則又不必移置, 而最是差備門之閉杜, 而移設他處, 事體重大。</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예조참판 김진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어제 예병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禮兵曹</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로 하여금 자세히 살피게 하라는 명을 인하여 낭청을 보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인정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仁政殿</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안팎의 뜰을 척량</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尺量</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한 뒤 병조 참의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과 함께 측량하였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숭정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崇政殿</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내외 뜰에 조목조목 기록한 바가 있으니 그 대강을 아뢰겠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숭정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崇政殿</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내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內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서부터 광달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廣達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까지 재어 보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인정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仁政殿</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안팎의 뜰에 비하여 줄어든 것이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만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6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척 남짓이었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숭정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崇政殿</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내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內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부터 건명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建明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까지 재어 보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인정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仁政殿</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안팎의 정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庭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서 남은 것이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603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자 남짓입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지난번 뜸을 뜰 때는 광달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廣達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상의 일로 한정하여 여쭈어 정하였는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렇다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인정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仁政殿</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의 뜰에 비해서 이렇게 많고 인정전 뜰은 평탄하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시어소는 지세가 기울어지고 또 근래에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번에 과거를 설행하는 것은 경사를 함께하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선비들이 갑자년과 기묘년처럼 널리 취하여 먼 지방의 구경하는 선비들이 반드시 전보다 배가 될 것이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광달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廣達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상만 허락한다면 결코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궐 안에서 중간에 포위를 설치하여 작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作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는 것은 일의 체모로 볼 때 온당치 못합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또 이미 외정</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外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에 허락하였으니 의당 많은 선비로 하여금 밟아 다치게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건명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建明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상으로 제한한다면 그대로 둘 수 있을 듯합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이 이르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건명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建明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한계로 삼으면</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창덕궁</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昌德宮</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내외의 뜰에 비해 더욱 넓어질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돈이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건명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建明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상에 한하면 보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步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가 비록 더하더라도 지세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직 명쾌하지 않은 듯합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김진규가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만약 건명문</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建明問</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상으로 한정한다면 각 관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변통할 수 있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임시로 옮긴 승정원의 대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臺廳</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과 춘방</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春坊</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등은 남쪽으로 한 도</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道</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를 옮길 경우 또 굳이 옮겨 둘 필요가 없지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가장 심한 것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차비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差備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을 닫는 곳인데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중대합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하생략</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04. 6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69</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6</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5</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span></u> <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정축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6/26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12</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span style="color: #ff0000;">신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관련 </span><span style="color: #ff0000;">36</span></p><p>兵曹參議<span style="color: #007600;">任胤元</span>三度呈辭。入啓。遞差。</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병조 참의 <span style="color: #006dd7;">임윤원</span></span><span style="color: #006dd7;"><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세 번째 정사를 올렸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입계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체차하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05. 6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lt;</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469</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25</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숙종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7</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4</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span></u> <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을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1/13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12</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禮曹, 副司直<span style="color: #0000ff;">任胤元</span>, 當日卒逝云。已行從二品實職, 弔祭致賻, 依法例擧行, 何如? 啓。依所啓施行。</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예조가 부사직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오늘 졸서</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卒逝</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 <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였다고 합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미 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품 실직을 지냈으니 조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弔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와 치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致賻</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신하가 죽었을 때 임금이 내리는 부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를 법례대로 거행</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계하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아뢴 대로 시행하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blockquote data-ke-style="style2">※ 諱 <span style="color: #006dd7;">윤원</span> 선조님의 기일은 숙종 38년(1712)7월 14일(족보 기록)</blockquote><p>&#160;</p><p>&#160;</p><p>&#160;</p><p>106. 死後 &lt;<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승정원일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102</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탈초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6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책</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영조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30</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일 병인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5/15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기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4">&#160;</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1754</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년</span><span style="color: #6e6e6e;" data-ke-size="size14">&gt;</span></p><p>&#160;</p><p>&#160;甲戌正月十六日申時, 上御<span style="color: #2eb100;">通明殿</span>。宗簿提調<span style="color: #007600;">西平君橈</span>, 御製編次人吏曹參判<span style="color: #007600;">趙明履</span>, 同爲入侍時, 左副承旨<span style="color: #007600;">任瑋</span>, 假注書<span style="color: #007600;">李聖圭</span>, 記事官<span style="color: #007600;">鄭宅臣</span>, 記注官<span style="color: #007600;">洪啓沃</span>。諸臣以次進伏訖。上曰,&#160;<span style="color: #007600;">西平君</span>年幾何耶?&#160;<span style="color: #007600;">任瑋</span>曰, 六十八矣。上曰, 何以熟知耶?&#160;<span style="color: #007600;">任瑋</span>曰, 臣家外孫矣。上曰, 然耶?&#160;<span style="color: #007600;">西平君</span>曰, 大王大妃殿氣〈候〉, 何如? 上曰, 安寧矣。上曰, 卿年六十八耶?&#160;<span style="color: #007600;">橈</span>曰, 然矣。上曰, 卿外祖誰耶?&#160;<span style="color: #007600;">橈</span>曰, 臣之外祖<span style="color: #007600;">任量</span>, 而與<span style="color: #007600;">任瑋</span>, 七寸間矣。上曰,&#160;<span style="color: #007600;">任胤元</span>·<span style="color: #007600;">舜元</span>, 俱爲卿外三寸耶?&#160;<span style="color: #007600;">橈</span>曰, 然矣。上曰, 今乃知卿外家矣。</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갑술년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일 신시에 상이 통명전에 나아갔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종부시 제조 서평군</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西平君</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요</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橈</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어제 편차인 이조 참판 조명리</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趙明履</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 좌부승지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위</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任瑋</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가주서 이성규</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李聖圭</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기사관 정택신</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鄭宅臣</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기주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記注官</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홍계옥</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洪啓沃</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 입시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하들이 차례로 나아와 엎드렸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이 이르기를</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서평군의 나이는 몇인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위</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가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6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입니다라고 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이 이르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어떻게 잘 알고 있는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위</span></u><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가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의 집안 외손입니다라고 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이 이르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런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서평군이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시냐고 하였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이 이르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안녕하시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이 이르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경은 나이가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6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세인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요가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렇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이 이르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경의 외조부는 누구인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요가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의 외조부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양</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은 임위와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촌 간입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이 이르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윤원</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과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임순원</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은 모두 경의 외삼촌인가</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이요가 아뢰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그렇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상이 이르기를</span></u><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지금 경의 외가를 알았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blockquote data-ke-style="style2">※ 화춘군 이정 이 서평군 이요의 아비이며, 諱 <span style="color: #006dd7;">양</span> 선조님의 사위가 되심.<br>※ 諱&#160;<span style="color: #006dd7;">위</span>&#160;선조님은 정랑공파 21세조로 찰방공파 諱&#160;<span style="color: #006dd7;">양</span>&#160;선조님의 친형인 정랑공파 諱&#160;<span style="color: #006dd7;">중</span>&#160;선조님의 증손이 되심.</blockquote><p>&#160;</p><p>&#160;</p><p>&#160;</p><p>&#160;</p><p>&#160;</p><p><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승정원일기에서 선조님의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諱</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로 검색된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847</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건 가운데 일상을 제외하고 이상의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10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건을 적습니다</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신병관련 상소 등 </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36</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건 포함</span><span style="color: #333333;" data-ke-size="size18">)</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bpA/a5330831cc8ba3cc0479ba91aef0da8630adfcc0" class="txc-image" width="30" height="3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bpA/a5330831cc8ba3cc0479ba91aef0da8630adfcc0" data-origin-width="165" data-origin-height="165"></div><p>&#160;</p>
<!-- -->
카페 게시글
고문헌에서 조상님을 探하다.
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② - 2 임윤원
임정혁
추천 0
조회 11
24.10.12 10:2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