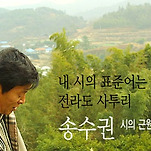<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r1z/1be14c35ac756e1b7703b9717b7d6b8f7a01bb9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r1z/1be14c35ac756e1b7703b9717b7d6b8f7a01bb9d" data-origin-width="561" data-origin-height="689"></div><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버드나무 길 / 박용래(1925-198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맘 천근 시름겨울 때</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천근 맘 시름겨울 때</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마른 논에 고인 물</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보러 가자.</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고인 물에 얼비치는</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쑥부쟁이</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염소 한 마리</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몇 점의 구름</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홍안紅顔의 소년같이</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보러 가자.</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함지박 아낙네 지나가고</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어지러이 메까치 우짖는 버드나무</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길.</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마른 논에 고인 물.</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속상할 때 부엌에 들어가 그릇을 씻고 있으면 마음도 설거지가 되더라는 어느 목회자의 말이 생각난다.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하니 속이 누그러진 것은 아마 인체는 7할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일찍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했다. 탈레스가 생명의 시원을 물로 말한 것은 현상 개념의 다양한 모습을 하나의 근본 원리로 설명하려한 대담성을 보여주었고, 철학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또한 물의 철학자 노자는 물은 다투지 않는다는 부쟁不爭이란 말을 하였다. 물은 산에 가로막히면 곡류하여 멀리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할수割水하여 몸을 나누어 흐르듯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억지 부리는 것을 다툼이라 하였으며, 밝은 거울과 정지된 물을 일컬어 명경지수明鏡止水라 하였다.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지만 물은 있는 그대로 사물의 모습을 비출 수 있다는 말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시인은 심사가 불편할 때 버드나무 길을 걸으며 천근 맘을 추스르고자 무논을 바라보곤 했는가 보다. “마른 논에 고인 물”(무논)은 노자의 명경지수와 같다. “얼비치는” 것들이야 “쑥부쟁이”, “염소 한 마리”, “몇 점 구름”이 다다. 그러나 부끄럼 많은, 어쩌면 사춘기 소년처럼 응시자가 돼보자고 한다. 그 길, 버드나무 길은 새참을 이고나가는 아낙과 메까치가 봄을 차려 내놓는 길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찬란한 봄의 향연보다는 자신을 비추어 생명의 길을 가야할 숭고한 의지가 투영되는 곳, “마른 논에 고인 물”이 있는 자연의 낯빛에 우리의 마음이 비쳐질 수 있다면 무논처럼 들꽃도, 염소도, 하늘의 구름도 맑게 떠오를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span></p><p>&#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