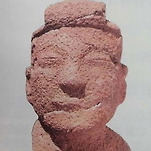<p><span data-ke-size="size18">단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斷絶</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나 교류 등을 끊어 버릴 때 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절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絶斷</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도 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족보에서 혈통은 어떻게 단절되는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전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前朝</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고려의 흔적을 지우고</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공신</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功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기록을 삭제하여 계대를 끊는 방법이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이는 절대자가 권력기반을 강화하고</span></p><p><span data-ke-size="size18">변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로 인해 문중의 계대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실록에 기록된 사례를 살펴보자</span></p><p><span data-ke-size="size18">조선은 상징성이 높은 문화재와 고려 임금의 어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동상이나 </span></p><p><span data-ke-size="size18">몇몇 불교 문화재들을 찾아내 땅속에 묻거나 불에 태웠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세종실록</span><span data-ke-size="size18">32</span><span data-ke-size="size18">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세종 </span><span data-ke-size="size18">8</span><span data-ke-size="size18">년 </span><span data-ke-size="size18">5</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19</span><span data-ke-size="size18">일 임자 </span><span data-ke-size="size18">9</span><span data-ke-size="size18">번째기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도화원에 간수된 전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前朝</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왕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王氏</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역대 군왕과 </span></p><p><span data-ke-size="size18">비주의 영자초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影子草圖</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불태웠고 </span></p><p><span data-ke-size="size18">태조 왕건의 진영</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쇠로 만든 주물상</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고려 </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대 왕 혜종의 </span></p><p><span data-ke-size="size18">진영과 조각상을 개성으로 옮겨 묻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고려 군주들의 영정과 역사서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렇게 사라진 공신들의 </span><span data-ke-size="size18">영정도</span> <span data-ke-size="size18">몇 점 남아있지만 </span></p><p><span data-ke-size="size18">묻히거나 불태워졌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세종실록 </span><span data-ke-size="size18">41</span><span data-ke-size="size18">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세종 </span><span data-ke-size="size18">10</span><span data-ke-size="size18">년 </span><span data-ke-size="size18">8</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1</span><span data-ke-size="size18">일 경진 </span><span data-ke-size="size18">3</span><span data-ke-size="size18">번째기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앞서 </span><span data-ke-size="size18">1170</span><span data-ke-size="size18">년 고려 무신난 시절 수많은 문신들이 처단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1</span><span data-ke-size="size18">백 년간 지속된 무신난으로 감히 문중들은</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삼국사기 편찬에 동참했던 편수자들은 해당 문중의 족보에서 사라졌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문중들은 멸문의 화를 면하기 위해 족보에 기록하는 것을 꺼렸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대체적으로 많은 문중들의 상계가 불분명한 이유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혈통의 단절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1420</span><span data-ke-size="size18">년 </span><span data-ke-size="size18">3</span><span data-ke-size="size18">월</span><span data-ke-size="size18">16</span><span data-ke-size="size18">일 집현전을 설치하고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span></p><p><span data-ke-size="size18">당부했다는 말이 회자되어 참조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우리 모두 목숨을 버릴 각오로</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조상을 위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후손을 위해 여기서 일 하다가 같이 죽자</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한문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역사칼럼니스트 수필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
<!-- -->
카페 게시글
한문수-깜빡 잊은 우리말
깜박 잊은 우리말, 역사 38 / 족보 단절의 암울한 기록
한 눌
추천 1
조회 12
25.04.07 14:0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