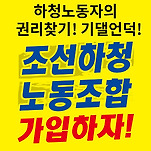<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BE04658C7FE750D"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300" width="300" exif="{}" data-filename="임금공제_1 복사.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17BE04658C7FE750DFE06"/></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얼마 전 한 하청노동자에게 연락이 왔다. “협력업체에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돼서 일을 그만두면, 회사에서 지급한 작업복, 안전화 등 소모품 값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는데 그런 도둑놈들이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이 같은 작업복, 안전화 값 공제는 중소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이미 흔한 일이다. 그런데 요즘 조선소가&nbsp;</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어렵다며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소 하청업체에서도 이 같은 임금 공제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쓸 때 노동자에게 해당 내용의 동의서 받기도 한다.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나가니 노동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억울한 맘이 앞선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nbsp;</span><!--[endif]--><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255, 0, 0);"><b>임금 임의공제 금지 </b></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근로기준법 제43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한 노동자의 임금을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 마음대로 작업복, 안전화값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그렇다면 노동자가 임금공제에 동의한 경우는 어떨까? 노동자가 사전 동의했다면 임금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청업체들이 근로계약서를 쓸 때 미리 임금공제 동의서를 받아놓는 것도 그 때문이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그러나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rgb(255, 0, 0);">작업복, 안전화 값의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다. 한 번 생각해보자. 작업복과&nbsp;</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안전화가 왜 필요한가. 회사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고 그래서 당연히 회사가 값을 지불하고 노동자에게 무</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즉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동의(계약)는 무효라는 얘기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nbsp;</span><!--[endif]--><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255, 0, 0);"><b>위약 예정 금지 </b></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사 3</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개월 안에 퇴사하면 소모품 값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는 명백한 불법이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금방 그만두면 여러 가지 손해가 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왜 노동자 책임이란 말인가? 작업복, 안전화 값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도둑질이다. 더 이상 눈 뜨고 도둑질 당하지 말자.</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5%;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br></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font face="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255, 0, 0);">* 작업복 안전화 값 임금공제 제보 및 노동문제 상담 :&nbsp;</span></font><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2pt;">010-6568-6881</span></b></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255, 0, 0);">*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a href="https://goo.gl/forms/N5broATiQE3GH5Wg2" target="_blank"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255, 0, 0);">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가입(클릭)</span></a><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nbsp;</span></b><span style="font-size: 11pt; text-decoration: underline;"><b><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b></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t;"><b><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255, 0, 0);">*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a href="https://goo.gl/forms/C7hsrpRvuG1WM1R53" target="_blank"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255, 0, 0);">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후원하기(클릭)</span></a><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span></b></span></p>
<!-- -->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조선하청노동조합> 제6호 - 작업복, 안전화 값 공제는 임금 도둑질이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