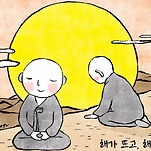<p><br></p><!--StartFragment--><p class="0" style="-ms-layout-grid-mode: both;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법</span><span style="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굵은안상수체영문;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mso-ascii-font-family: 굵은안상수체영문;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태고딕;">&#985172;</span><span style="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메기야 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굵은안상수체영문;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mso-ascii-font-family: 굵은안상수체영문;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9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Meghiya-sutta</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굵은안상수체영문;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mso-ascii-font-family: 굵은안상수체영문;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태고딕;">&#985173;</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굵은안상수체영문;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mso-ascii-font-family: 굵은안상수체영문;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A9:3),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태고딕;">&#985172;</span><span style="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법구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태고딕;">&#985173; </span><span style="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굵은안상수체영문;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mso-ascii-font-family: 굵은안상수체영문;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3/34</span><span style="font-family: 굵은안상수체;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굵은안상수체;">게송</span></p><p class="0"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10pt; -ms-layout-grid-mode: both;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text-autospace:;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5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8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내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8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140%; text-indent: 10pt; letter-spacing: -1pt; font-size: 12pt; -ms-text-autospace:;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95%;">총무 동명스님</span></p><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140%; text-indent: 10pt; letter-spacing: -1pt; font-size: 12.5pt; -ms-text-autospace:;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우리는 흔히 내 마음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나의 것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런데 내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던가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혹시 마음이 제멋대로 날뛰어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적도 있으신가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날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쥔 물건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없으신 적도 있으신가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마음과 관련된 경전과 게송을 살펴보겠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letter-spacing: -1pt; font-size: 13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한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13</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년째 안거</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세존께서는 짤리까에서 짤리까 산에 머무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 무렵에 메기야 존자가 세존의 시자로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때 메기야 존자는 세존께 다가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한 곁에 서서 메기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세존이시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저는 잔뚜가마에 탁발을 가고자 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 존자는 오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 탁발을 위해 잔뚜가마로 들어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잔뚜가마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 끼미깔라 강의 언덕으로 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 존자는 끼미깔라 강의 언덕에서 이리저리 경행하다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망고 숲을 보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것을 보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이 망고 숲은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수행자가 정진하기에 좋겠구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만일 세존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나는 이 망고 숲으로 정진하러 와야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라는 생각이 들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 존자는 세존께 말씀드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세존이시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저는 오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 잔뚜가마로 탁발을 갔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잔뚜가마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끼미깔라 강의 언덕으로 갔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저는 끼미깔라 강의 언덕에서 이리저리 경행하다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망고 숲을 보았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것을 보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이 망고 숲은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수행자가 정진하기에 좋은 곳이구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만일 세존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 망고 숲으로 정진하러 와야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세존께서 만일 허락해주신다면 저는 그 망고 숲으로 정진하러 가겠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다른 비구가 올 때까지 여기 있도록 해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두 번째로 메기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세존이시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세존께서는 더 해야 할 것이 없으시고 더 보태야 할 것도 없으십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세존이시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러나 저는 더 해야 할 것도 있고 더 보태야 할 것도 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세존께서 만일 허락해주신다면 저는 그 망고 숲으로 정진하러 가겠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다른 비구가 올 때까지 여기 있도록 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세 번째로 메기야 존자가 세존께 간청하자 세존께서는 허락하십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대가 정진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 존자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망고 숲으로 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는 망고 숲으로 들어가서 한 나무 아래 앉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조용히 명상하고 있는 메기야 존자에게 세 가지 번뇌가 일어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것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분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남을 해치는 생각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때 메기야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나는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런데도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과 분노와</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남을 해치는 생각에 빠져 있다니</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 존자는 세존께 다가가 절을 올리고 말씀드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세존이시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제가 망고 숲에 명상하고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세 가지 나쁘고 해로운 번뇌가 일어났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것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분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남을 해치는 생각이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다음 다섯 가지 법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마음의 해탈을 성숙하게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것은 첫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좋은 벗</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둘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계율 지키기</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셋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법에 관해 얘기하기</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넷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정진</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다섯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통찰지</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비구는 이러한 다섯 가지 법에 굳게 서서 다시 네 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탐욕을 제거하기 위해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부정관을 닦아야 한다</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악의를 제거하기 위해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자애를 닦아야 한다</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일으킨 생각을 자르기 위해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야 한다</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내가 있다는 자아의식을 뿌리 뽑기 위해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인식을 닦아야 한다</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letter-spacing: -1pt; font-size: 13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985172;</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법구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985173;</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에도 메기야를 위한 게송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메기야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내가 너에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내가 지금 혼자 있으니 다른 비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고 하지 않았느냐</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런데 너는 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侍者</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의 책임을 저버리고 수행하러 간다고 하면서 가버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비구는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마음이란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사람은 항상 마음을 잘 조절해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33, 34</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송을 읊으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letter-spacing: -1pt; font-size: 13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argin-lef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흔들리고 동요하며</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argin-lef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보호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마음을</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argin-lef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슬기로운 이는 바르게 만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argin-lef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화살을 만드는 이가 굽은 곳을 곧게 펴듯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letter-spacing: -1pt; font-size: 13pt; margin-lef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argin-lef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가 몸부림치듯</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argin-lef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이 마음도 또한 그렇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argin-lef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악마의 왕국에서 벗어나려고 수행 대상에 집중하면</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argin-lef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마음은 싫어하고 몸부림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argin-lef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985172;</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법구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985173;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33/34</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게송</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letter-spacing: -1pt; font-size: 13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내 마음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하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마치 물 밖을 벗어난 물고기가 몸부림치듯 요동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해탈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해탈은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달마조사에게 신광이 물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스님</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러면 그 괴로운 마음을 이 앞에 내놓아 보아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내가 편안하게 해줄 터이니</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마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마음이란 놈은 실체가 없어서 내놓을 수가 없는데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달마조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내가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케 했느니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이에 신광은 크게 깨달았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신광의 마음은 번뇌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마음이 어떤 실체여서 마음 자체가 괴롭거나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유로워졌던 것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부처님 시대에도 부처님의 말씀이나 게송을 들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나 사다함과 아나함과를 얻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라한이 되기도 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야말로 한생각 돌이키면 자신의 마음을 해탈시킬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마음을 해탈시킨다는 것은 마음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통제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해탈을 위해 다섯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십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첫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좋은 벗</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둘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계율 지키기</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셋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법에 관해 얘기하기</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넷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정진</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다섯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통찰지</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이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그래도 어려우시다구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친절하신 부처님은 또 가르쳐주십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즉</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위 다섯 가지 법의 토대 위에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부정관</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과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자애</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와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마음챙김</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을 닦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아울러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인식을 닦는 것입니다</span></u><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마하반야바라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p><p><br></p><p><br></p><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3.uf.daum.net/attach/99FFAD4D5CBFF223270F3B", "/cfile243/99/FFAD4D5CBFF223270F3B", "법회보제325호25630407자비명상법회.hwp", "grpid%3D1RGVD%26fldid%3DEwbd%26dataid%3D417%26fileid%3D5%26regdt%3D20190424142206&url=http%3A%2F%2Fcfile243.uf.daum.net%2Fattach%2F99FFAD4D5CBFF223270F3B")'><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법회보제325호25630407자비명상법회.hwp</a></p><p><br></p><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56.uf.daum.net/attach/999D534D5CBFF2242BE8AA", "/cfile256/99/9D534D5CBFF2242BE8AA", "법회보제325호25630407자비명상법회.pdf", "grpid%3D1RGVD%26fldid%3DEwbd%26dataid%3D417%26fileid%3D6%26regdt%3D20190424142206&url=http%3A%2F%2Fcfile256.uf.daum.net%2Fattach%2F999D534D5CBFF2242BE8AA")'><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법회보제325호25630407자비명상법회.pdf</a></p><p><br></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8544C5CBFF26C2A"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법회보제325호25630407자비명상법회001.jpg" id="A_9988544C5CBFF26C2A04EE"/></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5F54C5CBFF26D35"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법회보제325호25630407자비명상법회002.jpg" id="A_9925F54C5CBFF26D3545A0"/></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B554C5CBFF26D2C"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법회보제325호25630407자비명상법회003.jpg" id="A_995B554C5CBFF26D2CF6EF"/></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A834C5CBFF26F2C"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법회보제325호25630407자비명상법회004.jpg" id="A_995A834C5CBFF26F2CFDD7"/></p><p><br></p>
<!-- -->
카페 게시글
법회보
[법회보 제325호] 불기 2563년 4월 7일 자비명상법회(법담 동명스님)
동명스님
추천 0
조회 53
19.04.24 14:2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