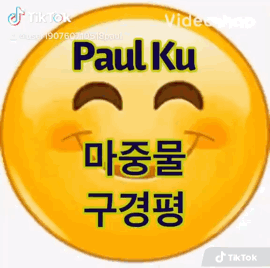<!--StartFragment--><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세기 조선 초에는 중국문명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이 완성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한글의 창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법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역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지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농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의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음악 등에서 민족문화가 정리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세기 이후 성리학은 예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禮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의 측면을 강조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禮</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의 질서를 강요함으로써 전쟁 후 격심해진 사회변동을 저지 억제하려 했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禮</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의 실천을 통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身分</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질서의 유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동족집단의 결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가부장적 폐쇄성을 강화하여 양반층의 지배권을 옹호하고 민중세계를 중세적 지배질서 속에 묶어두려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러한 목적으로 강조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禮論</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은 지배계급 자체를 심한 당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黨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속으로 몰아넣었고 반면 민중세계는 차츰 성리학적 문화의 굴레를 벗어나 문화영역을 넓혀 가면서 양반문화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兩立</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되는 민중문화를 발전시켜 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실학은 조선왕조 후기의 이와 같은 문화적 분위기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고려로부터 조선 초까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여 년에 걸쳐 반포된 법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교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관례 등을 총망라하여 세조때부터 편찬해오던 경국대전이 수차의 개정 끝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만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8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 완성되어 반포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고려조에서 여러 가지 정치 문제를 일으켰던 지리 도참사상은 조선 시대에 들어 와서도 크게 유행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태조는 하륜 등의 학자들에게 풍수를 연구하여 새 도읍을 정하게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나라 이름으로 쓰이는 조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朝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의 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가 아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태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의식이 반영된 조천의 의미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도학주의형의 독서관과 입신양명형의 독서관이 섞여 있던 조선 전기의 독서에 있어 가장 강조된 책은 소학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무당에게 세금을 물리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질병퇴치를 위해 국가가 무당을 동원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재난을 만났을 때 무당에게 굿을 하도록 허락한 기록 등은 조선조의 유교문화가 무속과의 양립을 전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의 공존을 원했다는 사실을 말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삼강오륜과 같은 유교의 윤리적 실천 강령을 행동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실행에 옮긴 것은 주로 양반의 상류계층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평민인 일반 민중들은 오랜 전통의 관행에 따라 천신을 비롯하여 산천과 조상의 영혼을 숭배하고 무속을 행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서당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활발해져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선비와 평민의 자제로서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 9</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세에서부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 1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세에 이르는 동몽들의 유학도장으로 중요시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서양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대체로 광해군때부터 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부연사 사신들에 의해 유입된 천주교 서적들에 대해 국내의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데 대략 숙종까지 서학 접촉시대를 갖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때에 천주교와 관계있는 인물로는 허균과 이수광이 유명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서학 연구가 성행해지자 국가에서는 당시 유학을 정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正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으로 받들고 있었으므로 정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서학이 탄압을 받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서학에 관심을 표명하고 비판을 가한 유학자들은 당대에 저명한 인사들로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수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63-162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을 비롯하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82-176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과 그의 제자 안정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712-179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가환 등을 들 수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학파로 보아선 당시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학문을 연구하던 남인계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성리학에서는 우주 자연과 인간이 합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合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할 수 있는 천인합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天人合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나 물아 일체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物我一體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을 주장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우리말과 일치되는 문자체계인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조선 초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곧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세기 중엽은 한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제반요건이 완비되는 시기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이 고조되었던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강점기에는 현실생활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정감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鑑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과 십승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十勝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기타 후천개벽사상들이 민간에 침투하여 여러 계통의 신흥종교 교단들이 형성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근본가치관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인의예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仁義禮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의 유교적 근본가치에 바탕한 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과 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가 중심에 있는 삼강오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三綱五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중인계급의 출현은 상하층의 간격을 좁혀 식생활 습관의 통일에 한몫을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그러나 조선시대 식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궁중음식을 중심으로 한 의례음식의 발달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것은 오늘날 한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韓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의 기초가 된 것으로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지위에 따라 상차림이 달랐고 같은 사람이라 해도 생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명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향연에 따라 그 차림이 달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궁중의 경우 평일의 수라상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첩을 차렸으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왕이 받는 상에는 각종 음식을 높이 괴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것들을 만들기 위해 진연도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進宴都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라는 관청을 두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각 전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殿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마다 올리는 상의 이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상의 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음식의 가짓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분량 등이 모두 달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러한 진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진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進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진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進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음식은 봉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封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라 하여 양반 가정에 전해지기도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이어 권농정책이 추진되고 왕권중심의 중앙집권제도가 확립된 시기로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상에 대한 봉제사와 가족제도에 따른 식생활이 중시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러한 배경 아래서 식품의 저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가공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리기술이 한층 발달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궁중음식 위주의 화려하고 풍요로운 상차림의 규범이 정착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주식은 역시 곡류로서 품종이 다양화하여 쌀의 경우만 해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종에 이르렀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기장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종에 달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그밖에 수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보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옥수수 등이 경작되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세기 중반에 일본의 쓰시마 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對馬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전래된 고구마와 감자는 구황식품으로 추가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육류는 교통수단으로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소와 말의 도살이 방지되어 돼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개 등이 주를 이루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또한 수산물도 종류가 다양해져서 어류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여 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해조류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여 종에 이르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명태가 이때 처음 등장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그밖에 조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오징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어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대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꼴뚜기 등의 젓갈류가 만들어졌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새우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멸치젓 등이 전국적으로 소비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한편 채소류는 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배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송이버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시금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미나리 등에 호박과 토마토가 외국에서 들어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특기할 것은 고추의 도입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는 일본에서 유입된 이래 젓갈류와 함께 김치에 쓰여 우리 식탁에 가히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그밖에 과실류에는 전시대의 것 외에 사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포도 등이 추가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시대 말에 단군교의 교전을 전수한 백봉이 도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禱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에서 찾아낸 바 있는 태백산 보본단 석실은 발해 문왕이 봉장한 수많은 전적이 감추어져 있던 곳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추존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있는 종묘는 정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국보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2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영녕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보물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2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등이 위치한 조선시대의 대표적 건조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절제된 건축미와 엄숙한 제례의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유현한 분위기가 감도는 영원의 공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교적 흐름은 수련도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저술은 한무외의 해동전도록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한무외는 이 저술에서 조선의 도맥이 태상노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太上老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위백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종리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최승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자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최치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명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김시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서경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홍유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곽치허를 거쳐 자신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중 태상노군은 노자를 가리키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위백양은 후한 사람으로 연단 중심의 당 도교에 주역과 황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즉 황제와 노자의 도를 배합하여 그 이론적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도교의 양생법을 강조한 참동계의 저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 참동계는 주자도 관심을 갖고 참동계주석을 펴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종리권은 금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金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에 성립된 전진교의 종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宗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인 여동빈에게 도를 전한 인물로 금단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른바 본성적 단학의 시조로 여겨지는 인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처럼 조선 중엽의 저술에서 주장되고 있는 도맥은 실재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도가적 수련에 심취한 지식인들의 가탁일 가능성이 높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는 이들 도맥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신라 하대와 조선시대 사이의 실존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명백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즉 조의적으로 배치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수련지향적인 전진교 계통의 도교를 받아들인 이 시기 지식인들이 유교적 도통론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계통을 밝힐 필요성을 느낀 데 기인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그러나 이 시기 이후 조선에서 수련도교나 도교적 은둔생활의 기풍이 형성되고 그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저술이나 의식은 큰 의미를 지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후 조선에서의 단학의 도맥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그러나 도교와 연관된 인물 등의 각종 이적을 기술한 홍만종의 해동이적이나 도교 관계의 각종 변증설을 수록한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도교 관계 저술들이 연이은 것으로 보아 지식층의 관심이 지대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그러한 생활양식이나 수련법이 꾸준히 맥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세종 때 평양에 사당을 지어 단군과 고구려 시조 동명왕을 함께 모신 이후로는 명실상부한 국조가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구월산에 삼성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환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환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단군을 배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가 있고 강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江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에는 단군의 무덤이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시대에 선비를 양성하는 교육의 목표는 인륜을 밝히는 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明人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시대에 와서는 삼국과 고려에 이어 마리산 제천단을 수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제사지낸 기록들이 나오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7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성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1639</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인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7), 170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숙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6), 176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영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1), 177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정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178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 등의 기록을 볼 수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29</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세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평양에 단군 사당을 세우고 동명왕과 같이 제사지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5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세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시조단군지위라고 위판을 고쳤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59</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 왕세자를 거느리고 친히 제사를 올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79</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9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에 신하를 보내어 제사지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729</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 숭령전이라는 액판을 하사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749</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 승지를 보내 제사지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은 솟을대문이 있는 행랑채로부터 시작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솟을대문은 가마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붕이 행랑채보다 높이 솟아오른 대문을 말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행랑채는 여러 노비들이 기거하는 작은 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불을 때는 부엌이 곁달려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행랑마당에는 한 곁으로 곳간과 가마고와 마굿간을 두어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전이공간의 구성을 보여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에서는 고려의 뒤를 이어 도교의 재초를 행하되 도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道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의 이름을 쓰지 않고 경복궁의 북쪽에 소격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昭格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를 두어 거기에 태일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太一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삼청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三淸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등을 세우고 천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天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성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星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신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神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등 수백위를 모셔 놓고 때때로 치재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지금의 삼청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성제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星祭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소격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昭格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등이 다 그 유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그러나 국가적 시설을 떠나서 단학과 선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仙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및 도교에서 나온 습속은 전대에 비하여 민간에 많이 행해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명군에게서 배운 관우의 숭배 등이 유행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왕조에서도 사농공상으로 대표되는 카스트제가 성립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는 고려의 카스트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귀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중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양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천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을 계승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양반계층의 하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노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의 일을 하거나 도축업을 하는 자들은 천민계층으로 분류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왕조의 궁궐로 태종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0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 경복궁 동쪽에 이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離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으로 조성한 창덕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궁정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창덕궁에는 인정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仁政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국보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2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대조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大造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보물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1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선정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政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보물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1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등이 있으며 왕가의 정원인 후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즉 비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秘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은 한국의 전통정원의 조형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조선은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노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奴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의 특색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클레망세는 대한제국 농상공부 우체사무주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888.1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에 임명되어 한국체신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주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90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월에는 우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우편엽서를 프랑스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이를 계기로 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Che;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GulimChe;">프랑스우편협정이 체결되었다</span></p>
<!-- -->
카페 게시글
─………♡ 역사적인♡글
15세기 조선 초에는 중국문명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이 완성되었다. 한글의 창제, 법전, 역사, 지리, 농업, 의학, 문학, 음악 등
해바라기
추천 0
조회 57
14.06.26 06:5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