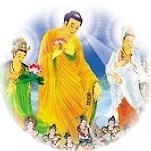<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궁서체; COLOR: #282828; FONT-SIZE: 20pt; mso-hansi-font-family: 궁서체; mso-ascii-font-family: 궁서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PAN style="FONT-FAMILY: Gungsuh,궁서">&nbsp;&nbsp;&nbsp;&nbsp;&nbsp;&nbsp;&nbsp;임제록 특강 제3강-2 (전통불교문화원)</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ngsuh,궁서;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10-3-&#36947;&#27969;야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10-4밖에서 찾지 말라. 10-5돌아가 쉬는 곳</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nbsp; &#36947;&#27969;(도류)야 &#32004;&#23665;&#20711;&#35211;&#34389;(약산승견처)인댄,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도류들이여 만약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3665;&#20711;</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의 견해에</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의지한다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3287;&#37323;&#36838;&#63847;&#21029;(여석가불별)이라.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석가로 더불어 하나도 다르지 않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0170;&#26085;&#22810;&#33324;&#29992;&#34389;(금일다반용처)가 &#27424;&#23569;&#20160;&#40637;(흠소심마)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네요.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0170;&#26085;&#22810;&#33324;&#29992;&#34389;가 &#27424;&#23569;&#20160;&#40637;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오늘 여러 가지로 작용하고 있는 그 곳. 우리가, 여러분 지방에서 모두 이 곳 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왔는데요. 찾아 올 줄 알아요. 어떻게ㆍ어떻게 하여튼 찾아왔습니다. 와서 또 시간되어서 접수하고ㆍ차 마시고ㆍ강의 듣고ㆍ식사하고 할 일 다 합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것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2810;&#33324;&#29992;&#34389;</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러면서 화장실도 가고ㆍ물도 마시고ㆍ잠깐 쉬기도 하고ㆍ온갖 할 것 다해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야말로</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2810;&#33324;&#29992;&#34389;</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신기</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하잖아요. 아주 신기해요. 아무리 세상에 컴퓨터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도 이것 보다 더 신기한 물건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없습니다. 참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신기한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겁니다. 그리고 또 잠자면서 꿈도 꿀 줄 알아요. 그리고 또 한숨 잤다 싶으면 턱 일어날 줄 알아요. 일어나면 또 어떻게 기계처럼, 기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자기 할 일 척 척 척 척 다 하는 겁니다. 나가서 화장실가고ㆍ세수하고ㆍ이불개고ㆍ바깥바람 쏘이고ㆍ식사 찾아먹고, 세상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신통방통한 물건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능력ㆍ이 가치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7424;&#23569;&#20160;&#40637;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부족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할 줄 아는 여기에서, 내일도 또 할 수</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있고ㆍ모레도 또 할 수</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있고ㆍ다음 날 또 할 수</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있고ㆍ또 할 수</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있고...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내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할 수</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거기에 뭐가 부족하냐? 이겁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7424;&#23569;&#20160;&#40637;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부족한 것이 뭐냐?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하~~ 참!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7424;&#23569;&#20160;&#40637;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만 외워도 됩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7424;&#23569;&#20160;&#40637;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만...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모자랄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7424;</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자.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도대체 뭐냐?</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이것에 대한 맛을 느끼고, 제대로 이해를 해도, 뭐 확 깨달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어떤 희열을 느끼고ㆍ맛을 느낀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ㆍ이보다 더 보물은 없으니까요.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ㆍ피곤하면 잠 잘 줄 알고ㆍ때로는 화도 낼 줄 알고ㆍ웃을 줄도 알고ㆍ슬퍼 할 줄 알고ㆍ또 울 줄도 알고ㆍ때로는 꼬롬한 생각이 들어가면 남 모함도 할 줄 알고ㆍ속일 줄도 알고ㆍ자기허물 감출 줄도 알고ㆍ남이 아픈데 찌를 줄도 알고,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것이 전부 중생으로서 좋지 아니한 악습이라고 모두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nbsp;&#8220;그것을 없앴을 때 부처다.&#8221;&nbsp;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차원 낮은 불교</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8220;&#21892;한 일만 하고ㆍ지혜만 있고ㆍ자비만 넘쳐야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것이 부처다.&#8221; &nbsp;라고 거의 일반불교에서 그렇</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게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가르치고 있는데, 절대 그것은 아주 하급 불교</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저기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법화경이나 화엄경, 그리고 이 조사 어록 같은, 특히 임제록 같은 입장에서의 불교적 안목은 뭐 착</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하고ㆍ자비롭고ㆍ지혜롭고, 이래야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부처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대로 남한테 해코지 하면 해코지 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부처다 이겁니다. 슬퍼 할 때 울 줄 아는 그 능력이 부처다ㆍ남 미울 때 미워 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부처다. 다른 불교에서는 그런 말 절대 없습니다. &nbsp;&#8220;남을 미워하는 것이 무슨 부처냐?&#8221; 그러지요ㆍ어림도 없지요ㆍ어림도 없는 소리</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우리는 어림도 없는 소리를 여태해온 겁니다. 지금 바깥의 많은 불교는 전부 그렇</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게 막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가르치고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이 선불교 차원이라는 것이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래서</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다르다는 것이지요.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그러니 여기에 대한 그 한 물건. 이 한 물건에 대한 진정한 이해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할 일 다 마친 겁니다. 정말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8961;&#20107;&#20154;</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래서 조사 어록에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런 말 많이 있지요. &#22823;&#26757;&#23665;(대매산) 법상선사가 마조스님 제자인데, 마조스님이 하루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481d0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1373;&#24515;&#26159;&#20315;(즉심시불)이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하는 소리 듣고는 &#8216;아! 그래? 나한테도 마음이 있고, 내가 곧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면 더 이상 더 풀 것이 있냐?&#8217;하고 대매산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사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요.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공부 잘 하는 사람이 보이다가 어느 날 안 보여서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nbsp;&#8220;그 사람,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481d0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1373;&#24515;&#26159;&#20315;</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라는 소리 한 마디 듣더니 그만 지 혼자 토굴에 가서 그냥 살고 있답디다.&#8221;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nbsp;&#8220;니 한 번 가봐라. 뭘 하는지 한 번 가봐라. 어떻게 됐는지 한 번 가봐라.&#8221;&nbsp; 고 눈 밝은 제자한테 시켰어요. 제자가 가서</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8220;스님 여기서 뭐 합니까?&#8221;</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8220;아이고, 우리스님이 즉심시불이라고, 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는데 더 이상 뭐 할 것이 있느냐?&#8221;</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8220;그래요? 그 때는 마조스님이 즉심시불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것 유행 지나가고 지금은 그런 말 안 한다.&#8221;&nbsp; 고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8220;요즘은 뭐라고 하느냐?&#8221;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8220;&#38750;&#24515;&#38750;&#20315;(비심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는 이런 소리한다.&#8221;뭐라고 하는가 싶어서 그렇</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게 한 번 떠 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거든요.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8220;노장이야 &#38750;&#24515;&#38750;&#20315;이라 하든 말든 나는 &#21373;&#24515;&#26159;&#20315;이다. 나하고 상관없다.&#8221; 고 또 하던 일을 그저 그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정말 아주 참 꿋꿋한 그런 고집물통이라고나 할까요? 자기 주체성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마조스님한테 전하니까, 거기 &#22823;&#26757;&#23665;입니다. 대매산을 빗대어가지고 &nbsp;&#8220;아~ 참! 매실이 참 잘 익었구나!&#8221;&nbsp; 하고 이렇게 인가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그런 어떤 차원의 말하자면 어떤 무위진인의 내용을 두고 부처</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라고 하는 것이고ㆍ그것을 조사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착</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하다ㆍ지혜롭다ㆍ그 사람은 남 모함할 줄도 모른다ㆍ속일 줄도 모른다ㆍ슬픔도 없다ㆍ화냄도 없다ㆍ탐욕도 없다. 그래야 부처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라고 하는 그런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것이지요. 이런 소리 듣고 덮어놓고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는 물론 안 되고, 정말 여기에ㆍ이런 이치에 참으로 제대로 심취한 사람은 어디 가서 남 해코지 하라 해도 하지도 않아요. 이런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할 턱이 없지요.</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경전에도요? &#35576;&#27861;&#28961;&#34892;&#32147;(제법무행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481d0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6010;&#24958;이 &#21373;&#26159;&#36947;(탐욕즉시도)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랬</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습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481d0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6010;&#24958;이 &#21373;&#26159;&#36947;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481d0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30603;&#24666;도 &#20134;&#24489;&#28982;이다(진에역부연)이다. &#36010; &#30603; &#30305;(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도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481d0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2914;&#26159;&#19977;&#27861;&#20013;에 &#20855;&#19968;&#64000;&#20315;&#27861;(여시삼법중 구일체불법)이라.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와 같은 &#36010; &#30603; &#30305; 삼독 속에</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481d0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일체불법을 다 갖췄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랬</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습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481d0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일체불법을 다 갖췄다. 보통 경전에도 대승 경전에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설법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사회악을 조장하자는 그런 것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 이것은 그런 것으로 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 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이야기할 상대가 못되는</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것이지요.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nbsp; 그래서 그야말로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스님의 그 정신이 이와 같</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기 때문에 달리 우리가요? 수행을 해가지고 하~ 완전히 착해진 뒤에ㆍ완전히 슬픔이 없어진 뒤에ㆍ완전히 분노가 없어진 뒤에,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때 부처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라고 하는</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런 말은, 그런 가르침은 답이 없습니다ㆍ영원히 답이 없습니다ㆍ영원히 답이 없어요.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그런 어떤 한계를 뛰어 넘어서 부처 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말로만 있지요. 말로만... 그런 것을 다 이행한 뒤에 그 때야 부처다.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라고 하는 것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말로만 있지 실질적으론 존재하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않</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습니다. 그것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ㆍ듣고ㆍ부르면 대답하고ㆍ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ㆍ피곤하면 잠 잘 줄 아는 그 능력, 바로 그 사람이 부처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라고 하는 데는 바로 그 자리에 그것이 답</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그것이 답이라고요.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282828; FONT-SIZE: 16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가장 고차원적인 불교이면서 가장 쉬운 불교고요, 그것이 가장 아주 정확한 불교</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그래서</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뭐라고요?</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40644;&#34327;&#20315;&#27861;&#28961;&#22810;&#23376;(황벽불법무다자)라.</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황벽불법이 몇 푼어치 안 되는구나. 바로 몽둥이 칠 줄 아는 것. 그 나름대로 살아있는 불법을 보여주는 그 사실. 그것을 떠나서 달리 없잖아요.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8220;배휴~&#8221; &nbsp;하니까 &nbsp;&#8220;예&#8221;&nbsp; 하고 대답하는 그 사실. 거기</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에 무슨 선악이 붙을 수</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있습니까?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래서 육조스님도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481d0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19981;&#24605;&#21892;&#19981;&#24605;&#24801;(불사선불사악)하라.</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첫 법문이 그랬잖아요. 도명존자에게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이 자리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선도 해당 되지 않아요ㆍ악도 해당 되지 않아요. 선하다고 부처이고, 악하다고 부처가 아니고 그것 아닙니다. 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라고요.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그래서 임제록은&nbsp; &#8220;어록중의 왕&#8221;&nbsp; 이라고 그러고,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스님을 이렇게 표현</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합니다. &#8220;</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이전에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 없고,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이후에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 없다.&#8221; 아~! 이보다 더 뛰어난 말은 없습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부처님은요? 과거에 수많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부처님이 있습니다. 미래</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에도 수많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부처님이 있습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아닙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는 임제이전에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 없었습니다.&nbsp;</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후에도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 없고요. 아~! 대단한 표현이지요</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런 임제스님을 알아주는 후손들도 또 대단하지요. 그것 다 안목이 밝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nbsp;부처는 부처</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전에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부처 있었고, 부처</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후에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부처 있습니다. 하지만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는 임제이전에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 없고,</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후에도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 없습니다. 그런 것을 또 여기서 넘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열 두 시간 이것 참, 임제록 펴놓고 너무 아까운 시간</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최소한도 한 일주일은 앉아서 줄기차게 여기서, 이 좋은 환경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8961;&#20301;&#30494;&#20154;(무위진인)</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 가슴에서 꿈틀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생각도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그 다음에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밖에서 찾지 말라</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이것도 같은 형식인데요.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38568;&#34389;&#20316;&#20027;(수처작주)</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의 의미ㆍ</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8961;&#20301;&#30494;&#20154;</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의 의미, 그것이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내 가슴에서 꿈틀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임제스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여기도 그런 내용으로써... 잠깐 볼까요?</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10-4 밖에서 찾지 말라</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2823;&#24503;(대덕)아 &#19977;&#30028;&#28961;&#23433;(삼계무안)이 &#29494;&#22914;&#28779;&#64004;(유여화택)이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7492;&#19981;&#26159;&#20766;&#20037;&#20572;&#20027;&#34389;(차불시이구정주처)니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8961;&#24120;&#27578;&#39740;(무상살귀)가 &#19968;&#21049;&#37027;&#38291;(일찰라간)에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19981;&#25536;&#36020;&#36068;&#63796;&#23569;(불간귀천노소)니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0766;&#35201;&#33287;&#31062;&#20315;&#19981;&#21029;(이요여조불불별)인댄 &#20294;&#33707;&#22806;&#27714;(단막외구)어다</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0766;&#19968;&#24565;&#24515;&#19978;(이일념심상)의 &#28152;&#28136;&#20809;(청정광)은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6159;&#20766;&#23627;&#35023;&#27861;&#36523;&#20315;(시이옥리법신불)이며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0766;&#19968;&#24565;&#24515;&#19978;(이일념심상)의 &#28961;&#20998;&#21029;&#20809;(무분별광)은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6159;&#20766;&#23627;&#35023;&#22577;&#36523;&#20315;(시이옥리보신불)이요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0766;&#19968;&#24565;&#24515;&#19978;(이일념심상)의 &#28961;&#24046;&#21029;&#20809;(무차별광)은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6159;&#20766;&#23627;&#35023;&#21270;&#36523;&#20315;(시이옥리화신불)이니 &#27492;&#19977;&#31278;&#36523;(차삼종신)은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6159;&#20766;&#21373;&#20170;&#30446;&#21069;&#32893;&#27861;&#24213;&#20154;(시이즉금목전청법저인)이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31063;&#29234;&#19981;&#21521;&#22806;&#39347;&#27714;(지위불향외치구)하면 &#26377;&#27492;&#21151;&#29992;(유차공용)이니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5818;&#32147;&#35542;&#23478;(거경론가)하면 &#21462;&#19977;&#31278;&#36523;(취삼종신)하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9234;&#26997;&#21063;(위극측)이나 &#32004;&#23665;&#20711;&#35211;&#34389;&#19981;&#28982;(약산승견처불연)이니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7492;&#19977;&#31278;&#36523;(차삼종신)은 &#26159;&#21517;&#35328;(시명언)이며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0134;&#26159;&#19977;&#31278;&#20381;(역시삼종의)니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1476;&#20154;&#20113; &#36523;&#20381;&#32681;&#31435;(고인운 신의의립)이요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2303;&#25818;&#39636;&#35542;(토거체론)이라하니 &#27861;&#24615;&#36523;&#27861;&#24615;&#22303;(법성신법성토)는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6126;&#30693;&#26159;&#20809;&#24433;(명지시광영)이니라. </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22823;&#24503;(대덕)아 &#19977;&#30028;&#28961;&#23433;(삼계무안)이 &#29494;&#22914;&#28779;&#64004;(유여화택)이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7492;&#19981;&#26159;&#20766;&#20037;&#20572;&#20027;&#34389;(차불시이구정주처)니 &#28961;&#24120;&#27578;&#39740;(무상살귀)는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19968;&#21049;&#37027;&#38291;(일찰라간)에 &#19981;&#25536;&#36020;&#36068;&#63796;&#23569;(불간귀천노소)니라.</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우리가 그 자리,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8961;&#20301;&#30494;&#20154;</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의 자리를 증명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현실에 이대로 살면서 끊임없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야말로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19977;&#30028;</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가 편안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난 집과 같아요. 오래있을 곳이 못 돼요.</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8961;&#24120;&#27578;&#39740;가 &#19968;&#21049;&#37027;&#38291;에 &#36020;&#36068;.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귀한사람ㆍ천한사람ㆍ늙은 사람ㆍ젊은 사람을 결코 가리지 않고&#65292; 순식간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늘 겪고 있는 겁니다. 늘 겪고 있는 것.</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그런데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8961;&#20301;&#30494;&#20154;</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의 자리에만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30494;&#31354;(진공)상태입니다.&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0494;&#31354;상태. 그리고 저~ 기 태풍의 눈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조용해요. 조용한 자리입니다. 태풍 주변으로ㆍ변두리로 나와서 휘둘리고ㆍ바람맞고ㆍ비오고 그렇</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지,</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태풍의 그 눈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본성자리에 딱 차고 앉아 버리면ㆍ그것이 내 삶이 돼버리면ㆍ내 인격이 돼버리면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FONT color=#282828>&nbsp; </FONT>&#20766;&#35201;&#33287;&#31062;&#20315;&#19981;&#21029;(이요여조불불별)인댄,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대가 조사와 부처로 더불어 다르지 않고자할진댄,</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20294;&#33707;&#22806;&#27714;(단막외구)로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다만 밖을 향해서 구하지 말지어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이미 있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 만드는 것이 아니야ㆍ다듬는 것이 아니야. 무슨 조각품 같으면 다듬어서 되지만, 이것은 본래 갖추어진 것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기 때문에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20766;&#19968;&#24565;&#24515;&#19978;(이일념심상)의 &#28152;&#28136;&#20809;(청정광)은,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너희들 한 마음, 한 생각 마음 위에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8152;&#28136;</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한 빛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6159;&#20766;&#23627;&#35023;&#27861;&#36523;&#20315;(시이옥리법신불)이며,</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이것을 그대들 집,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3627;&#35023;&#27861;&#36523;&#20315;.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여기서</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대의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3627;&#3502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집 속</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이라고 하는 것은</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대의 육신 속에 있는 법신불이고,</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20766;&#19968;&#24565;&#24515;&#19978;(이일념심상)의 &#28961;&#20998;&#21029;&#20809;(무분별광)은,</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분별이 없는 그 빛은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6159;&#20766;&#23627;&#35023;&#22577;&#36523;&#20315;(시이옥리보신불)이요.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대들 속에 있는 보신불이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20766;&#19968;&#24565;&#24515;&#19978;(이일념심상)의 &#28961;&#24046;&#21029;&#20809;(무차별광)은,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차별이 없는 광명은</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6159;&#20766;&#23627;&#35023;&#21270;&#36523;&#20315;(시이옥리화신불)이라.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대들 육신속의 화신불이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우리가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7861;&#36523;ㆍ&#22577;&#36523;ㆍ&#21270;&#36523;.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것을 교학 상으로는 대단히 참 심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임제스님 보기에는 그것 전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8961;&#20301;&#30494;&#20154;.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지금 말하고ㆍ듣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저 편의상 이래 저래 나눠놓고 이야기한다.</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7492;&#19977;&#31278;&#36523;(차삼종신)은 &#26159;&#20766;&#21373;&#20170;&#30446;&#21069;&#32893;&#27861;&#24213;&#20154;(시이즉금목전청법저인)이라.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했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않</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습니까?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7861;&#36523;ㆍ&#22577;&#36523;ㆍ&#21270;&#3652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은 다른</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것이 아니라 그대들 바로 이 순간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0446;&#21069;</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에서 법문 듣고 있는 그 사람이다. 법문 듣고 있는 그 사람</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ㆍ말하는 소리 듣고 있는 그 사람</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무엇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듣고 있는지 그것은 저도 모르지요.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그래 우리가 &nbsp;&#8220;눈으로 본다ㆍ귀로 듣는다&#8221;&nbsp; 이런 말이 불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것 의미 있는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말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겁니다.&nbsp;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돋보기로 글자 크게 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잖아요.&nbsp; &#8220;</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돋보기로 본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8221;&nbsp; 하듯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돋보기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돋보기로 보는 것이지요.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nbsp;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귀로 듣는 것이지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말도 상당히 의미 있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말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좋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말입니다.&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것이 꼭 불교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 불교 역사가 깊으니까 불교에서 나온 말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쓰는 말이지요. 여러분도 돌아가서 포교 일선에서 그 한 마디만 가지고도 임제록 다 이야기할 수가</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8220;우리가 눈으로 본다ㆍ귀로 듣는다ㆍ돋보기로 글자본다. 하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8221; &nbsp;해가지고, 임제록 펴놓고 주해를 달기 시작하면 다 달 수가</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있는 것이지요. 이 보십시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1373;&#20170;&#30446;&#21069;에 &#32893;&#27861;&#24213;&#20154;이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법신ㆍ보신ㆍ화신, 아무리 현묘한 소리를 이끌어다 이야기해봐야 바로 눈앞에서 말하고 말 듣고 하는 그 사실 = 그 &#30070;&#39636;(당체) = 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심성이라는 &#24615;자. 마음심이라는 &#24515;자. 이런 소리를 잘 쓰는 조사 스님이 있는가 하면, 이 임제스님은 사람 &#20154;자를 잘 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직접적</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사</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람이라는 것 속에는 그대로 마음이 다 있지요. 마음 없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사</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람 없습니다. 마음 없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사</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람은 송장이지요.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육신 없는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사</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람은 뭐지요? 귀신이지요.&nbsp;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사</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람이라는 것 속에는 완전해요. 완벽합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그러기 때문에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임제스님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사</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람이라는 말을 제일 잘 쓰셨는데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8961;&#20301;&#30494;&#20154;</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라든지ㆍ</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2893;&#27861;&#24213;&#20154;</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라든지 아주 좋은 표현</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31063;&#29234;&#19981;&#21521;&#22806;&#39347;&#27714;(지위불향외치구)하면,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다만 밖을 향해서 치구하지만 아니하면, 밖을 향해서만 구하지 아니하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6377;&#27492;&#21151;&#29992;(유차공용)이니라.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이러한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1151;&#29992;</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 있다. 무슨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1151;&#29992;</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요? 법신이니ㆍ보신이니ㆍ화신이니 하는 것, 이것 전부 우리가 밖을 쫓아 헤매다 보니까 그런 능력을 다 잠재워 두는 것이지, 그렇</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지</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아니하고 자기 자신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으면 법신ㆍ보신ㆍ화신이, 경전에서 설명한 그런 능력이 다 있다 이겁니다.</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nbsp; &#25818;&#32147;&#35542;&#23478;(거경론가)하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경론가에 의거한다면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1462;&#19977;&#31278;&#36523;(취삼종신)하야, &#19977;&#31278;&#36523;</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을 취해서</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9234;&#26997;&#21063;(위극측)이나, &#26997;&#21063;</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을 삼는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렇</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지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19977;&#31278;&#3652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을 가지고 최고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6997;&#2106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라고 삼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신불은 부처중의 부처를 법신불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6997;&#2106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을 삼나니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2004;&#23665;&#20711;&#35211;&#34389;&#19981;&#28982;(약산승견처불연)이니,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3665;&#20711;&#35211;&#34389;</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에 의거하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렇지 않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말입니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7492;&#19977;&#31278;&#36523;(차삼종신)은 &#26159;&#21517;&#35328;(시명언)이며,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름이고 말일 뿐이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말입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0134;&#26159;&#19977;&#31278;&#20381;(역시삼종의)니라.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또한 세 가지의 의지처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말입니다.&nbsp;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름을 만들어놓고 그 이름에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21476;&#20154;&#20113;(고인운), &#21476;&#20154;</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 말하기를</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36523;&#20381;&#32681;&#31435;(신의의립)이요,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몸이라고 하는 것은</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뜻에 의지해서, 법신ㆍ보신ㆍ화신하는 것은 전부 뜻에 의지해서 세운 소리이고,</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2303;&#25818;&#39636;&#35542;(토거체론)이라하니, &#22303;.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토가 있어요, 무슨 법신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481d0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2823;&#23490;&#20809;&#22303;(대적광토)ㆍ&#22823;&#23490;&#20809;&#27583;(대적광전).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그러</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잖아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런 국토도 있습니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국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국토</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라고 하는 것도 전부 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신체에 의거해서 논하는 것이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7861;&#24615;&#36523;&#27861;&#24615;&#22303;(법성신법성토)는 &#26126;&#30693;&#26159;&#20809;&#24433;(명지시광영)이니라.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분명히 알건데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무슨 &#31070;이니ㆍ무슨 국토니, 부처 따라서 국토가 다 있습니다.</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경전에</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보면 어느 국토에서</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어떤 부처님이 왔다. 전부 부처 있는 데는 국토가 다 있거든요. 경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길 펼쳐놨어요. 그것도 또 방편이지요. 전부가 방편이지요. 우리 한 마음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여기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돌아가 쉬는 곳</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했는데요. 49재 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법문</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메모 해놨다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49재 법문들 이것 가지고 하세요.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10-5 돌아가 쉬는 곳</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2823;&#24503;(대덕)아 &#20766;&#19988;&#35672;&#21462;&#63811;&#20809;&#24433;&#24213;&#20154;(이차식취농광영저인)하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6159;&#35576;&#20315;&#20043;&#26412;&#28304;(시제불지본원)이요 &#19968;&#64000;&#34389;(일체처)가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6159;&#36947;&#27969;(시도류)의 &#27512;&#33293;&#34389;(귀사처)니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6159;&#20766;&#22235;&#22823;&#33394;&#36523;(시이사대색신)도 &#19981;&#35299;&#35498;&#27861;&#32893;&#27861;(불해설법청법)하며</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33086;&#32963;&#32925;&#33213;(비위간담)도 &#19981;&#35299;&#35498;&#27861;&#32893;&#27861;(불해설법청법)하며</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34395;&#31354;(허공)도 &#19981;&#35299;&#35498;&#27861;&#32893;&#27861;(불해설법청법)하나니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6159;&#20160;&#40637;(시심마)가 &#35299;&#35498;&#27861;&#32893;&#27861;(해설법청법)고</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6159;&#20766;&#30446;&#21069;&#63884;&#63884;&#24213;&#21247;&#19968;&#31623;&#24418;&#27573;&#23396;&#26126;(시이목전역역저물일개형단고명)</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한 &#26159;&#36889;&#31623;(시자개)가 &#35299;&#35498;&#27861;&#32893;&#27861;(해설법청법)이니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33509;&#22914;&#26159;&#35211;&#24471;(약여시견득)하면 &#20415;&#33287;&#31062;&#20315;&#19981;&#21029;(변여조불불별)이니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0294;&#19968;&#64000;&#26178;&#20013;(단일체시중)에 &#63745;&#33707;&#38291;&#26039;(갱막간단)하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35320;&#30446;&#30342;&#26159;(촉목개시)언마는 &#31047;&#29234;&#24773;&#29983;&#26234;&#38548;(지위정생지격)하고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4819;&#35722;&#39636;&#27530;(상변체수)로다 &#25152;&#20197;&#63959;&#24315;&#19977;&#30028;(소이윤회삼계)하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1463;&#31278;&#31278;&#33510;(수종종고)하나니 &#33509;&#32004;&#23665;&#20711;&#35211;&#34389;(약약산승견처)하면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nbsp; &#28961;&#19981;&#29978;&#28145;(무불심심)하며 &#28961;&#19981;&#35299;&#33067;(무불해탈)이니라 </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22823;&#24503;(대덕)아,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아~ 좋네요. 우리를 보고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2823;&#24503;아,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라고 불렀습니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우리는 무조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2823;&#2450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0766;&#19988;&#35672;&#21462;&#63811;&#20809;&#24433;&#24213;&#20154;(이차식취농광영저인)하라,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대들은 또한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5672;&#21462;.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알아서 취하라. &nbsp;&#8220;너희 것으로 만들라.&#8221; &nbsp;하는 뜻에서 알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5672;</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자만 놔둔 것이 아니고, 취할</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21462;</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5672;&#21462;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알아가지고 너희 삶으로 하라ㆍ너희 인격으로 만들라. 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말입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무엇을요?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63811;&#20809;&#24433;&#24213;&#20154;,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빛과 그림자를 희롱하는ㆍ가지고 노는 그 사람. 이것은 빛이라는 것은 별 의미 없고,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그 사람ㆍ그림자를 조종하는 그 사람을 잘 알아서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1462;</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하라. 이런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말입니다.</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26159;&#35576;&#20315;&#20043;&#26412;&#28304;(시제불지본원)이요,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어떤 깨달은 사람도 이것, 이 몸뚱이.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0809;&#24433; =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몸뚱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몸뚱이를 조종하는 사람을 잘 알아라. 이 몸뚱이를 조종하는 그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다ㆍ근원이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19968;&#64000;&#34389;(일체처)가 &#26159;&#36947;&#27969;(시도류)의 &#27512;&#33293;&#34389;(귀사처)니라.</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그렇게 되면ㆍ그것을 알게 되면ㆍ그 자리만 알게 될 것 같으면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19968;&#64000;&#34389;.</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어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곳이 전부 여러분이 돌아가 쉴 그대들의 집이다. 집에 돌아갈 곳이다 이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말입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 다음부터</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26159;&#20766;&#22235;&#22823;&#33394;&#36523;(시이사대색신)이 &#19981;&#35299;&#35498;&#27861;&#32893;&#27861;(불해설법청법)하며,</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그대들의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2235;&#22823;&#33394;&#36523;.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지ㆍ수ㆍ화ㆍ풍 사대로 된 이 육신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설법하고 청법 할 줄 알지를 못해. 말을</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말을</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들을 줄도 몰라.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33086;&#32963;&#32925;&#33213;(비위간담)도 &#19981;&#35299;&#35498;&#27861;&#32893;&#27861;(불해설법청법)하며,</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33086;&#32963;&#32925;&#33213;도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또한 설법하고 청법 할 줄을 몰라.</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렇다고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허공이 하느냐</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34395;&#31354;(허공)도 &#19981;&#35299;&#35498;&#27861;&#32893;&#27861;(불해설법청법)하나니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34395;&#31354;도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설법하고 청법 할 줄을 알지를 못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러면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26159;&#20160;&#40637;(시심마)가 &#35299;&#35498;&#27861;&#32893;&#27861;(해설법청법)고?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무엇이 설법할 줄 알고 청법 할 줄 아는가?</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6159;&#20766;&#30446;&#21069;&#63884;&#63884;&#24213;&#21247;&#19968;&#31623;&#24418;&#27573;&#23396;&#26126;(시이목전역역저물일개형단고명)한</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6159;&#36889;&#31623;(시자개)가 &#35299;&#35498;&#27861;&#32893;&#27861;(해설법청법)이니라. &#30446;&#21069;에.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대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0446;&#21069;</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에서</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너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63884;&#63884;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ㆍ너무 역역하다고요. 그러면서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19968;&#31623;&#24418;&#2757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도 없어ㆍ</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19968;&#31623;&#24418;&#2757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도 없어요ㆍ그 물건은 먼지만한 꼬투리도 없어요. 이 우주를 다 덮고 있어요.&nbsp;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먼지만한 꼬투리 하나 없어요.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1247;&#19968;&#31623;&#24418;&#27573;</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19968;&#31623;&#24418;&#2757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도 없는, 그러면서 그것만이 홀로밝아요.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3396;&#26126;.</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그것만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만이 있다. 그것만이 이 우주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여럿이 같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각자마다 다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불 하나만 켜놔도 이 방 가득 차고, 두 개 켜놔도 그 등불 하고 관계없이 그 등불은 그 등불대로 꽉 채웁니다. 천개 만개 등불 켜놔도 역시 똑 같이 천개 만개는 각자 빛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그것이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3396;&#26126;</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홀로 밝힌다 이겁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0446;&#21069;</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에</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있습니다. 분명히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0446;&#21069;</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에... 너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63884;&#63884;</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합니다. 먼지만한 꼬투리 하나 없습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1247;&#19968;&#31623;&#24418;&#27573;.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그러면서 그것만이 비추고 있습니다.&nbsp;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3396;&#26126;</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이것이,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6889;&#31623;가 =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것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32893;&#27861;&#35498;&#27861;</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할 줄 앎이니,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33509;&#22914;&#26159;&#35211;&#24471;(약여시견득)하면,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만약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와 같이 본다면&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0415;&#33287;&#31062;&#20315;&#19981;&#21029;(변여조불불별)이니라.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곧 조사와 부처로 더불어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것만 알면ㆍ그 실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해만 깊으면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대로 조사입니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20294;&#19968;&#64000;&#26178;&#20013;(단일체시중)에 &#63745;&#33707;&#38291;&#26039;(갱막간단)하야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35320;&#30446;&#30342;&#26159;(촉목개시)언마는,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정말 그 물건, 그것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0294;&#19968;&#64000;&#26178;&#20013;에 &#63745;&#33707;&#38291;&#26039;</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ㆍ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뭐 잠깐 기절해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기절하는 것이지, 그 물건이 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었다고 그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단이 없어요ㆍ사이가 없습니다. 허공이 사이가 없듯이, 허공이 사이가 없듯이 우리의 그 물건도 사이가 없어요.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5320;&#30446;&#30342;&#26159;</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보는 것 마다 다 그것입니다.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 놈이 본다 이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보는 것 마다 전부 그것다.&nbsp;&nbsp;&nbsp;</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nbsp;</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0342;&#26159;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그렇</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지만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우리는 왜 그렇</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게 못 되는가?</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FONT color=#282828>&nbsp; </FONT>&#31047;&#29234;&#24773;&#29983;&#26234;&#38548;(지위정생지격)하고 &#24819;&#35722;&#39636;&#27530;(상변체수)로다.</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이</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것도 유명한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말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24773;&#29983;&#26234;&#38548; &#24819;&#35722;&#39636;&#27530;.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다만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477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 생기니까</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지혜가 막힙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477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라고 하는 것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마음에 색이 칠해지는 겁니다.</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4773;</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라고 하는 것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마음&#24515; = &#24516;(심방변)에 푸를 &#38737;(청)자 했</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잖아요.</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것이 제대로 투명하게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내 나름의 어떤 인연 따라 보는 것이고ㆍ내 나름의 지식 따라서ㆍ내 나름의 가치관 따라서ㆍ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것.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것을 동원해 가지고 보는 겁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도... 저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100명 모였으면 100명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저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이해하는 겁니다.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실체 없습니다.</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그 어떤 오랜만에 만난 도반 스님이, 어디 가면 자기를 아는 사람은 아주 존경하고 위해주고 뭘 어떻게 해줄 줄 몰라서 그렇</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게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하는 겁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그리고 그 스님 자기 말이라면 아주 모든 걸 다 잘 믿고요.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그런데 어디 암자에서 한 다섯 명인가 모여서 정진을 했는데요. 다섯 명 모였는데 두 사람은 자기를 그런대로 보는데, 두 사람은 자기를 아주 안 좋게 보더래요.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아주 안 좋게 보더라는 겁니다. 자기하고 같이 사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할 정도로 그렇</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게</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180도로 자기를 다르게 보더라. &#8220;내가 실체가 있으면 어지간히 모두 비슷비슷하게 볼 텐데, [나]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라고 하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실체가 없</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사람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실체가 없어요ㆍ실체가 없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전부 내 깜냥대로ㆍ내가 축 쌓은 어떤 이해대로ㆍ이해정도 따라서 보는 겁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렇</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믿을 것도 아니고, 남이 누가 &nbsp;&#8220;어떻다.&#8221; &nbsp;</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라고 하는 것,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것도 절대 믿을 것이 못됩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절대 그것 휘둘려가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좋다고 하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4773;&#29983;&#26234;&#38548;</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그 마음에 색깔이 칠해지니까, 그것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477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거든요.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자기 나름의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477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자기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나름의 이해를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477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라고 그래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4773;</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 생기면 지혜가 막혀버립니다. 투명하게 보는, 전부 안경에 색이 칠해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자기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자기를 보는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것도 마찬가지</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nbsp; &#24819;&#35722;&#39636;&#27530;라.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생각이 변하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9636;</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가 달라져요. &#24515;&#39636;가 달리보인다고요.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심체는 변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게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다르게 느껴집니다.</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5152;&#20197;로 &#63959;&#24315;&#19977;&#30028;(소이윤회삼계)하야,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러므로 삼계에 윤회해서</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1463;&#31278;&#31278;&#33510;(수종종고)하나니,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갖가지 고통을 받게 되나니, 밖으로 팔려 다니니까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353535;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래서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그런 것이지요.</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33509;&#32004;&#23665;&#20711;&#35211;&#34389;(약약산승견처)하면, &#23665;&#20711;의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견해에다가 =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5211;&#34389;.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견처라는 말도 잘 쓰지요. 우리가 익숙하면 &nbsp;&#8220;견해ㆍ소견&#8221; &nbsp;이런 말 안 쓰고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35211;&#34389;</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어록에서 아주 잘 쓰는 말이니까요. </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23665;&#20711;의 &#35211;&#34389;</SPAN></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에 의지한다면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8961;&#19981;&#29978;&#28145;(무불심심)하며 &#28961;&#19981;&#35299;&#33067;(무불해탈)이니라.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내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은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00808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28961;&#19981;&#29978;&#28145;</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이야. 매우 깊고 깊은 그 자리가 아닌 사람이 없어. 해탈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전부 해탈이네. 임제스님 말씀, 임제스님 자기가 보기에는 전부 해탈되어 있는데... </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SPAN>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nbsp; 해탈한 사람이 보니까 다 해탈되어 있겠지요. 해탈한 우리의 본성을 보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진짜 나] 를 보는 것이지요. 임제스님은 &nbsp;[진짜 나] 를 보는 것이고, 우리는 내 자신이지만 [가짜 나] 를 보는 것이고요.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282828; FONT-SIZE: 16pt;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그래 가짜를 보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밉게 보고, 저 사람은 곱게 보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깊고 깊은 경지이고ㆍ그대로가 해탈된 경지다. </SPAN></SPAN></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nbsp;</P>
<P style="LINE-HEIGHT: 30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P>
<!-- -->
카페 게시글
○☆º━···참선 마음수행
스크랩
임제록 특강 제3강-2(전통불교문화원)10-3-道流야~밖에서찾지말라.돌아가쉬는곳.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