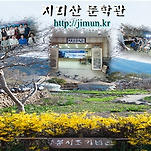<p><span class="pcol1 itemSubjectBoldfont"><font color="#333333" size="4">현대 시조문학사 개관(現代 時調文學史 槪觀)</font></span> <span class="cate pcol2"><img width="1" height="11" class="pcol2b fil3"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logimgs.naver.net%2Fimgs%2Fnblog%2Fspc.gif"><font color="#333333"> </font><a class="pcol2" href="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kwank99&amp;categoryNo=6&amp;from=postList&amp;parentCategoryNo=6"><u><font color="#333333">자료실</font></u></a><font color="#333333"> <img width="105" height="1"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logimgs.naver.net%2Fimgs%2Fnblog%2Fspc.gif"></font><font color="#333333"> </font></span> </p><p class="date fil5 pcol2 _postAddDate">2015.12.06. 14:54</p><p class="fil3 dline"></p><p class="url" id="url_kwank99_220560255644" style="float: right;"><img width="21" height="13" title="http://blog.naver.com/kwank99/220560255644" class="btn_urlcopy _setClipboard" id="copyBtn_kwank99_220560255644" alt="복사"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logimgs.naver.net%2Fnblog%2Fbtn_urlcopy.gif"> <a class="fil5 pcol2" href="http://blog.naver.com/kwank99/220560255644" target="_top"><u><font color="#333333">http://blog.naver.com/kwank99/220560255644</font></u></a> </p><div class="btn_post_v"><a class="btn_translate btn_atype _goTran _param(220560255644) _transPosition _returnFalse" id="transBtn220560255644"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wank99&amp;logNo=220560255644&amp;parentCategoryNo=6&amp;categoryNo=&amp;viewDate=&amp;isShowPopularPosts=false&amp;from=postView#" target="_blank"><u><font color="#333333"><em class="_goTran _param(220560255644)"><span class="pcol2 fil9 _goTran _param(220560255644)">번역하기</span></em><span class="tp pcol2b fil3 _goTran _param(220560255644) _returnFalse"></span><span class="rt pcol2b fil3 _goTran _param(220560255644) _returnFalse"></span><span class="bm pcol2b fil3 _goTran _param(220560255644) _returnFalse"></span><span class="lt pcol2b fil3 _goTran _param(220560255644) _returnFalse"></span></font></u></a> <a class="btn_vierw_v btn_atype _open_magazineviewer _param(220560255644|0|6|)"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wank99&amp;logNo=220560255644&amp;parentCategoryNo=6&amp;categoryNo=&amp;viewDate=&amp;isShowPopularPosts=false&amp;from=postView#" target="_blank"><u><font color="#333333"><em><span class="pcol2 fil9">전용뷰어 보기</span></em><span class="tp pcol2b fil3"></span><span class="rt pcol2b fil3"></span><span class="bm pcol2b fil3"></span><span class="lt pcol2b fil3"></span></font></u></a> </div><div class="clear blank5"></div><p class="post_option"></p><div class="post-sub ptr" id="sendPost_from_service_220560255644" style="display: none;"><p><span class="pcol2" id="sendPost_from_service_H_220560255644"></span></p></div><p><!-- 스마트에디터3 타이틀 제거 임시 적용 --> </p><div id="postViewArea"><div class="post-view pcol2 _param(1) _postViewArea220560255644" id="post-view220560255644"><span style="font-family: 바탕,batang,applemyungjo;"><span style="font-size: 10pt;"><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대 시조문학사 개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現代 時調文學史 槪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문학의 개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槪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 문학의 전통으로 계승해 온 시조문학은 조선시대에 꽃을 피워 오랜 동안 정형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定型文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한 장르로서 그 위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位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전승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선조 중기 이후 차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조선조 말엽에는 전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傳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끊어질 정도로 작품 활동이 적어졌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기에 일본의 압박과 함께 시가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歌文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아무 말살 단계에 있을 무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190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부터 육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53;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남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南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창작으로 인해 다시 계승의 맥을 찾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조문학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전승해 온 문학 작품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천년 역사 위에서 현금 우리가 외국의 고유 문학 작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전통문학으로서 소개해 주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자랑할 수 있는 문학 형태의 일종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문학 작품의 한 장르가 오랫동안 진흙 속에 묻혀 햇빛을 못 보고 있었던 것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가 우리 문학을 지키려는 힘이 약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것에 대한 애착심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0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육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53;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작품이 창작 발표되면서부터 현대시조의 싹은 트기 시작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에는 육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53;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남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南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춘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春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광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光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요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耀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담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4205;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정인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寅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등의 작품이 발표되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19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년대에 와서야 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은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殷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가람 이병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秉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김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등이 현대시조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산맥을 이루어 현대시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현대시조 속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감득할 수 있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형태의 자유로움도 찾아보겠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람의 작품에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들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격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格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찾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박한 우리 생활의 참모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 감지할 수 있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작품에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생활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生活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시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찾아볼 수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세 산맥의 시조작품관은 다음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로 인하여 현대시조 부흥기를 맞아하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때 시조문학의 이론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람이 주로 동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선문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에 발표하여 새로운 시조문학의 부흥을 부르짖고 나섰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제 우리는 특수한 문학의 한 집단을 가진 것이 곧 시조문학임을 자각하면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7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간 발달해 온 시조문학의 자취를 살펴보기로 하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초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初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시조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대 시조문학의 초기를 살펴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190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싹이 트기 시작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0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이후 육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53;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춘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春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요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耀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담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4205;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시대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사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백팔번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百八煩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출간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192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년에 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19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년대를 전후하여 작품을 창작해 온 시인은 앞에 언급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4, 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인에 불과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깨진 벼루의 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g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다 부서지는 때에</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혼자 성키 바랄쏘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금이야 갔을망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벼루는 벼루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무른 듯 단단한 속은</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알 이 알까 하노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남선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깨진 벼루의 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고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古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古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회상의 안타까움 같은 시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일관된 세계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에 비하면 춘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春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언어의 묘미를 달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達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여 자기화하면서 언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어의 다스림을 할 줄 아는 시인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담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4205;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정인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寅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매월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梅月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은 고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古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풍미를 받아 현대감각으로 이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移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하려는 시정신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대화체 시어의 다스림도 이 시대로서는 높은 격을 살려놓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한편 주요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朱耀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은 예리한 자기의 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에 대한 조화된 작품세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그의 작품은 현대적 감정의 요리가 잔잔한 강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江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같은 품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봉선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에서도 똑 같은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중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中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시조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조문하그이 중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中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19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년대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년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194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년 해방까지를 넣어보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19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년대에는 육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53;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춘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春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주요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朱耀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김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설의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薛義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박영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담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4205;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가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양주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66;柱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등의 활동이 있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조문학의 이론에 있어서는 한 줄기 꽃을 피운 듯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가람은 신시대의 문학으로서의 시조작품의 부흥을 부르짖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그는 시조가 우리의 전통문학으로서의 또 다른 발전의 여지가 있음을 피력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가람의 세계</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은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殷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은 국학사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國學史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연구가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한국적 정신 선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揚</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에 있어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인자라는 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그리고 그의 시작품 내용과 사상면에 있어 동양적인 유교사상이 광활하게 작용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그 사상이 작품 안에서 향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작품 속에서 감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感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시를 보면 첫째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삼위일체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三位一體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를 엿볼 수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둘째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그의 시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삼위일체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三位一體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도 체득할 수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런 사상을 현대의 한국 시인들에게서 감지감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感知感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할 수 있는 시인들이 없음은 곧 동양적 인 사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한국적인 사상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내 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내 정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에 대한 결여가 반증되고 있음도 현대시에서 알 수 있다고 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사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사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것은 우리들 현대인들의 생활과 정신에 있어 가장 지음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知音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존재가 되어 있음은 동양의 정관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靜觀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사상의 원천이 되고 있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유교적인 사상임을 알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러한 사상을 근본으로 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은 시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생활을 해 왔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 작품 속에 맥맥이 흐르고 있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육도관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53;道觀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사상 배합임을 작품을 통해 볼 수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동해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東海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g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썰물이 아침을 싣고 수평선 밖으로 나가더니</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밀물이 저녁을 안아다 이 언덕에 풀어 놓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동해는 세월을 씹으며 번둥거리고 누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온갖 어족이랑 산호랑을 삼키고서</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해와 달만은 언제나 뱉어 버리고</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동해는 영원히 여기 늙지 않고 누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동해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東海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에서 정관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靜觀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면서도 그 내부에서 깊고 높게 자아의 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를 외치고 잇음을 김자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동해는 세월을 씹으며 번둥거리고 누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는 조용한 속의 높은 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세계를 엿볼 수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동해는 영원히 여기 늙지 않고 누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는 영원한 자아독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自我獨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과 동해와의 정관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잇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밀물과 썰물의 지혜로운 교류 속에 자기가 안립안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安立安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하고 있는 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세계는 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시작세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作世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에서만이 우리가 감득할 수 있는 현대시의 맛이라고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시에 있어 의관세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儀觀世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는 허다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그는 자연과 인간생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정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경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문화 등 만흥 시의 소재 가운데서 은유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隱喩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으로 표현한 의관세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儀觀世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비유적으로 표현한 의간세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儀觀世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가 있음을 그의 시인다운 풍모와 시 가운데 넘쳐흘러 자리분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自利憤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을 막아주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끌어주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가리켜주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인지상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忍之相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하게 해 주고 있는 시인의 작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새 지도를 그려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g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인간의 역사란 묘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墓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도 없는 옛 무덤</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폐허의 남은 지역마저 산불처럼 타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어디서 조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弔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소리라도 들려올 것만 같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산도 끝났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물도 끝났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다만 빈 하늘 빈 바다 빈 마음</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인은 막대 끝으로 새 지도를 그려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3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선의 원한을 안고 살아온 한국 민족에겐 마음 밑바닥에 통일의 염원이 깔려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 염원을 위하여 우리들은 매일같이 묵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0665;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과 기도를 올리고 있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거천하지폐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居天下之廢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입천하지정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91;天下之正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를 상상해 보지 않는 남아가 어디 있을 것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흔적이나 푯말이 어디에 박혀 있는 것도 아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그냥 대대손손 살아온 오늘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폐허의 남은 땅마저 불기둥이 타고 있는 현실 앞에 선 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은 티끌 같은 자기의 존재를 이미 달각자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達覺自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한 도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道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었기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행천하지사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行天下之士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를 부르짖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빈 하늘과 빈 바다와 빈 자기 마음을 안아보는 대도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大道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풍모를 상상해 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한 인간으로 돌아온 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은 막대를 짚고 서서 자연과 인간이 혼연일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渾然一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가 되는 순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그 막대 끝으로 세계의 자기 지도를 그려보는 대도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大道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대시인의 위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位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을 상기해 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탱자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g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여기는 바닷가 어느 마을 탱자 울타리</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가다가 주춤 서서 부질없는 그이 생각</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어루만져 보는 가슴 속의 탱자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연약하고 가냘픈 꽃송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꽃잎에까지도 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은 그냥 스치고 가질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탱자꽃 한잎에 선심세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善心世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와 인관세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仁觀世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꿈을 엮고 있는 어진 마음의 표현이 충만히 넘침을 감지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은 동경 유학시절부터 이미 천재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암기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暗記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 좋기로 이름 높은 시인이기도 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고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古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나이에도 자기가 쓴 시는 모조리 술술 외며 옛날 시작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古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인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선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先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담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談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등을 기억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인간이라기보다는 도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道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 모두가 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지혜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갈매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자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가 일체화하여 한 편의 시를 완성한 듯한 이 작품을 보아도 그의 지혜의 척도를 재어 볼 수 있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 창작사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 정신을 생활화하기란 무척 어려운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은 앞의 몇 가지의 규명에 의하여 시와 같이 생활할 수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또 해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는 한 시인의 성장과 성숙이 어떠한 만족의 정신 방향을 지침하는 일도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한국민족은 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살아온 겨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압박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굴욕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생활도 다 같이 겪은 우리는 불안한 표류에 불안한 정착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것은 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 살아온 동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道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한국인 전체가 살아온 도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道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런 생활이 거듭해 온 한국의 정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사상의 상황은 언제나 주체의식을 잃고 살아온 지난날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은 모름지기 주체의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민족의 전통을 이어온 사상가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인인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우리나라 시조문학에 있어 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은 실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첫째는 역사적인 점에 있어서 시조 창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5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년이라는 선구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둘째는 질적인 면에서 그의 작품이 최고의 지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地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를 확보하고 있을뿐더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셋째 양적인 면으로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인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천 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라는 최고의 작품수를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인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 방으로는 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눈을 삼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이 한 장으로 우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宇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가렸지만</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원히 태양과 함께 밝을 대로 밝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가람 이병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秉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첫 수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약적인 표현을 시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것이 성공한 작품으로 꼽히는 시조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좁은 세계에서 영원에의 희귀를 연상하는 가람의 시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한국의 현실과 과학의 발전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 고유의 역사적 의식을 조화했다고 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람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밝은 광명의 미지세계라고 한다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미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意味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상통되는 장순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張詢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통일대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統一大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자기 철학의 깊이를 가진 고조화된 시적 의미를 사긴 세계라고 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민족과 역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과의 조화의 세계로도 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 시조가 외면성의 운율의 세계보다 내면성의 내재율적인 면에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는 입증을 가진 작품세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람은 농촌에서 자랐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농촌에서 숨을 거둔 농촌의 아들이기에 농춘을 옆에 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씨/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네 두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살다가 농촌에 조용히 묻힌 순수한 시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는 명예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금욕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권력도 다 헌신짝같이 버리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던져놓은 시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학자의 양심을 지니고 살다가 죽어간 시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릿잎 파릇파릇 종다리 종알종알</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물 캐던 큰아기도 바구니 던져 두고</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듯한 언덕 머리에 콧노래만 잦았다</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볕이 솔솔 스며들어 옷이 도리어 주체스럽다</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바람은 한결 가볍고 구름은 동실동실</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몸도 저 하늘로 동동 떠오르고 싶다</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삼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心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도 흙의 사상은 그의 여우언한 고향처럼 생각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생을 살아온 시인작품마다 사용된 언어 속에는 흙 내음이 물씬 풍겨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첫 수의 농촌의 봄 들판을 연상케 하는 시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관찰하는 눈과 생각이 일치되게 표현의 대상으로 표출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둘째 수에서는 공사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空思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자아의 공간적 존재의 의미를 시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의미에 운율적인 면은 협소한 듯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심어진 농촌 춘월의 농부와 농촌 여인들의 생활 양상이 눈에 선하게 떠오는 듯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주 쉽고 순수한 한글 전용으로 대화하듯 우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46;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게 흐르는 언어의 배열 배합은 가람의 특징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의 시 구성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기에 현대시조의 생활화에 큰 영향을 끼친 시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2) 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의 시조문학</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는 많은 시조작가들이 활동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초에는 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은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殷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람 이병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秉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요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朱耀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담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4205;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정인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寅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설의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薛義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조종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趙宗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김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박영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김기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起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서항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徐恒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박종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鍾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김팔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八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등의 작품이 주로 발표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이들은 한결같이 조국애와 동포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향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정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9</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情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의 시세계로 일관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집 오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梧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설의식</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려더니</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봄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을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제런 듯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이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도 오는 양하여 내 못잊어 하노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설의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薛義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자연동화와 자아이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自我移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세계는 고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古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틀 안에서도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영만의 시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춘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春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그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에 발표한 작품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생생한 시어의 결합은 곧 그간에 자기화한 언어의 선택에서 배합된 작품세계의 구축일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김기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基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八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無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현대화된 멋을 부려본 작품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대 감각의 차원 높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세계를 구축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종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鍾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인생무상을 읊어 민족적인 애달픈 정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情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그려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간성과 공간성의 융합 속에 인생의 허무 상념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의 작품으로 능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종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趙宗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망각에로의 여로가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망각에의 재현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로와 재현의 위상 표출은 인간의 오관작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五官作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의한 직관의 힘에 대한 조력적인 체공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滯空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직결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든 세상 만물에 대한 체공사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滯空思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인간 본래의 본관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내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自然內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광선 같은 존재를 의미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의 시세계는 이러한 인간의 내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內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한 일체를 체념하는 마음속에서 시적 진실이 공존공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共存共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할 수 있다는 증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證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시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3)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와 동아일보</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후기에 있어서는 우리 시조문학이 양보다는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응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張應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야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寒夜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신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吳信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양버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호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鎬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남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曺南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영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趙泳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상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相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白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작품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 추천을 받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중 장응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張應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생활에 대한 안정감과 자기 수련의 발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오신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吳信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생을 원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遠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는 자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慈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자애로운 본성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本性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이호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鎬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지로운 자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自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자연과의 동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세계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후기를 장식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회에 걸쳐 동아일보의 신인 시조작품 모집은 시조문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후기를 빛나게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丁文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호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鎬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신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吳信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상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相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홍영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洪永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을 발굴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중에 승려시인이던 홍영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洪永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섬세하고 유미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唯美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시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영향이 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7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세상을 뜰 때까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수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 &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余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 시조와 수필집을 발행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 부흥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復興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방과 시조작가들</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4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해방과 함께 우리는 현대시조의 부흥기를 맞이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말과 우리글을 다시 찾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사 표현의 자유를 찾았던 때문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02;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람을 필두로 많은 시인들이 다시 우리 사조무학을 계승하는 데 붓을 들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방 전에 시조시인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 명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방 후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4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 명 가까이 되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이/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을 끈 시조시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상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66;相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방의 종소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얼마나 자유의 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유의 민족을 원했던가를 알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강산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경소리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을 풀고 자유의 나래 속에 조국 산하를 울림한다는 희열에 넘친 시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양상경 자신과 우리 민족의 염원이었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丁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학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東鶴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는 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자연의 묘미가 시조에서만이 가능함을 보여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물과 날짐승이 일체화를 이루고 있음을 감득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남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白南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인생의 허탈감을 매혹시켜 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성한 백발은 곧 인간의 연륜의 가치를 표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표현시키고 있음을 내면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종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宗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도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多島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바다의 풍경을 시심이 아니면 체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표현키 어려운 점을 잘 다루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창파와 백파의 합일화한 자연 배합의 묘미가 잘 조화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두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高斗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空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배합을 위한 간결한 언어 배열로 자기를 표백시키고 잇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상 열거한 몇몇 시조작가는 일제 말기에 창작 활동을 해 오다가 해방과 함께 활발히 작품을 발표한 시인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2) 195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의 시조작가</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시인들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5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에 와서는 대가족으로 늘어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은 시조문학의 부흥과 한국인의 전통문학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25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피와 눈물과 땀의 응결이 있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생명과 자유와 싸움 속에서 시정신을 키운 것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5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의 시인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작품 활동을 한 시인들은 다음과 같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영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永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오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午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창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昌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병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炳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일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一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재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在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종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鍾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혁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58;爀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상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66;相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병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은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영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永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호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응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태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항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신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순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응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소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종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성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승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허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홍영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기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해성 등이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병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炳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월동방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無月洞房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한국적인 정한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칠석 밤의 차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次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높은 시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농도가 비범해 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표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는 시와 인간의 동일한 생활관을 가진 애국애족의 시정신을 가진 시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기환의 여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餘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의 자유자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自由自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그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자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自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거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미 같은 인간의 노력을 다시 행각케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순하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통일대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統一大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민족정신의 발로가 응결된 작품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일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一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련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木蓮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자비한 생활관을 표출시켰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승범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산의 정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精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인간의 기력을 융합할여고 애쓴 작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상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5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작품 중에서 골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음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5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발행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대시조선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現代時調選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태극 공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수록한 작가들 중에서 뽑은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두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高斗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기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基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기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琪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상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상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尙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영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永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오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午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찬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瓚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창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昌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희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禧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권덕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權悳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운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9;雲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자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95;子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민동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閔東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노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63801;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병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炳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용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瑢&#40665;</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일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一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재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在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종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宗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종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鍾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변영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卞榮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남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白南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명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徐明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정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徐定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항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徐恒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설의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薛義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영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申瑛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혁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58;爀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안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安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상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66;相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주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66;柱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광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光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관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寬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병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秉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영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永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은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殷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응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應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태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泰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항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恒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호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鎬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희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熙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신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吳信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순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張諄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응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張應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정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張貞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인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寅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顯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丁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종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趙宗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요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朱耀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남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南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성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聖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승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勝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현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鉉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탁상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卓相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피천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皮千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용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韓&#63940;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허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許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진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玄鎭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홍영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洪永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3)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와 이태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泰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는 한국 현대시조문학의 부흥에 있어 큰 역할을 한 터전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에 불평하는 분도 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많은 시조시인이 배출되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훌륭한 창작 생활을 하고 있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月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태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泰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사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私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털어가며 잡지의 명맥을 이어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추천 시인들</span></p><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름</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작품</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름</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작품</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방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芳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새벽의 육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肉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시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時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열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熱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석성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釋性愚</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작이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逝作二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영성</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팽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제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45;齊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秘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지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張芝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포도밭에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재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蘇在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호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虎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徐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교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敎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억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31.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태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泰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31.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석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石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노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31.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정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靜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31.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나기 나린 후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後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병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曺秉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제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濟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계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춘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韓春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천지여 겨레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오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曺五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直指寺紀行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재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趙載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농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13;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의홍</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삿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66;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위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圍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1&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윤금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尹今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고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琦告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상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相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나그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진복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晋福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자와 반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환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奐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정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珽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夏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평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平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침이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상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相&#40665;</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식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月蝕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동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東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경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炅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새벽뜰에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상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相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파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波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30.0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월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月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30.0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pt; margin-left: 1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9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진양호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9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晋陽湖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9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9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30.0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병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兪炳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30.0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쑥댓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상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45;相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적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寂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금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金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연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新&#63888;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은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殷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남북서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南北序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준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俊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행시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紀行詩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한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漢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연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88;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자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45;子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혼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婚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준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准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98pt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앙저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俯仰低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2.24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2pt; height: 15.65pt;"><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4pt; margin-left: 4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td></tr></tbody></table><p class="0" style="-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時調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가 하도 좋아 나도 얽어 보던 것이</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벌써 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어제런듯 흘렀구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늘 또 한수 얻고서 어린인양 들레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태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泰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時調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는 천품으로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고하는 모습으로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언행으로나 시조시인다운 천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天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갖춘 시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언제 보아도 잔잔한 강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江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같고 그야말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月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아호 그대로 잔잔한 달빛 같은 사도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師道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인간상을 지닌 시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앞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란 작품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간을 시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가꾸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살아온 그의 자화상 같은 시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구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린 양 같은 심정으로 어린이의 동심 같은 천신천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天心天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어린 마음으로 하루해를 보내는 시인의 생활 양상을 엿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4)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 동인지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창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靑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대시조문학의 발전상에서 더듬어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순수한 시조 작품 동인지가 해방 전에는 전혀 없던 사실을 알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른 종합 동인문학지는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2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전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全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가람을 주축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新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인지가 나왔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195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時調文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6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대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大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황희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黃希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주축으로 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靑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 창작 동인지가 나왔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196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대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大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이호우를 중심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낙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65;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196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진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晋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박재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심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197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토요동인회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삼장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三章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197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시조연구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임헌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88;憲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황희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복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애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趙愛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해성 등의 참가로 이루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인지 중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靑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집으로 최고의 발간 호수를 이루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자시조문학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밭시조동인회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이름으로 발족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당시 동인들은 남준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南駿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황희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黃希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동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해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海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용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瑢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집에 실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작품집은 주로 꽃을 소재로 각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各自</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작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作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보여주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당시 유일한 시조문학지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맞선 최초의 동인지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65. 1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는 임헌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88;憲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채희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蔡喜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교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敎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이 가담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66. 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는 이복숙이 가담해 구인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九人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집까지 이르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66. 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부터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밭시조동인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란 이름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자시조동인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 고쳤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호 발간 기념호로 출판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시조선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 대역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시조문학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개칭하여 동인회 성격을 탈피하여 본격적이고도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5) 196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의 시조작가들</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6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에 와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의 발간과 함께 일간신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한 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신춘문예 현상작품을 모집하여 많은 신인을 배출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음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6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에 발행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의 시조시인 주소록에 오른 시인들로서 이 당시 창작 활동을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원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6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두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高斗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高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경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景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기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琪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민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敏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상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相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석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錫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어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魚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영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永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오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午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월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月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제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濟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광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光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해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海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경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敬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병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炳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일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一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재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在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배병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裵秉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배태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裵泰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徐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정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徐定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선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宋船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혁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58;爀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상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66;相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신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吳信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성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45;聖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태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45;台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가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家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근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根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덕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德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명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命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병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秉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상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相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영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永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우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祐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우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禹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은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殷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태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泰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항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恒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호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鎬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희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熙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임영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88;永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순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張諄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응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張應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규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全圭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소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韶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완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椀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용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63940;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재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在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태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泰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하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夏庚</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丁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재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趙載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종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趙宗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승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勝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성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聖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한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河漢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허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許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음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7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발행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조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에 기록된 시조시인의 명단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Removed Tag Filtered (&lt;!--[if !supportEmptyParas]--&gt;) -->&nbsp; <!-- Removed Tag Filtered (o:p) --></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강인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姜寅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두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高斗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高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교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敎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기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琪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경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景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만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萬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미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美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상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相&#40665;</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상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相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상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尙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승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承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시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時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시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市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어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魚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오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午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이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63967;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영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永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월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月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제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濟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정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正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종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鍾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준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准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춘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春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태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兌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호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虎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해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海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경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敬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병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炳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상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相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시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始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일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一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재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재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在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평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平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항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朴沆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배병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裵秉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배태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裵泰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변학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卞鶴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徐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정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徐定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석성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釋性愚</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반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班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재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蘇在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선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宋船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혁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58;爀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상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66;相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동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866;棟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신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吳信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동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庾東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병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兪炳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상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45;相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성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45;聖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자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45;子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제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45;齊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태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45;台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윤금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尹今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동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吳東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경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炅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근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根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금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金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명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命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방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芳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복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福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상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相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시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時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영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永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영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英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용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瑢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우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禹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우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禹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월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月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은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殷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은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殷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응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應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상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相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정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靜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준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俊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태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泰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한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漢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항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恒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환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奐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희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69;熙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임영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88;永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임헌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988;憲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순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張諄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정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張正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지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張芝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규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全圭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외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기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箕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덕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德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소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韶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丁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완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椀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재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在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태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泰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하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鄭夏庚</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丁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병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曺秉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오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曺五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애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趙愛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종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趙宗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재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趙載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진복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晋福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성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聖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승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勝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재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載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진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崔辰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한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河漢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분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韓粉順</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춘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韓春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허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許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함초롬바탕;">ㆍ</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황순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黃淳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indent: 13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황희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黃希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text-indent: 13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해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754;海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 : &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현대시문학개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韓國現代詩文學槪說</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g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유문화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함초롬바탕;">.1978) -</span><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strong style="padding: 0px 7px 0px 0px;">[출처]</strong> <a href="http://blog.naver.com/kwank99/220560255644"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현대 시조문학사 개관(現代 時調文學史 槪觀)</font></u></a><span style="padding: 0px 7px 0px 5px;">|</span><strong style="padding: 0px 7px 0px 0px;">작성자</strong> <a href="http://blog.naver.com/kwank99"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재봉틀</font></u></a></p></div></span></span><br></div></div>
<!-- -->
카페 게시글
시조문학관
현대 시조문학사 개관(現代 時調文學史 槪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