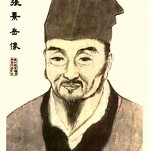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03.&#160;치(治)를 논(論)하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소변불금</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小便不禁</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치료(治)에 있어서 고방(古方)에서는&#160;<span style="color: #00cc00;">고삽</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固澁</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많이 사용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마땅하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그런데 고삽(固澁)한 방제(劑)는 그 문호(門戶)를 고(固)하는데 불과(不過)하고, 이 또한&#160;<span style="color: #00cc00;">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標</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를 치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治</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는 의미(意)일 뿐이지,&#160;<span style="color: #0000ff;">근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塞</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는 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道</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는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소수</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小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비록 신(腎)에서 이(利)하지만, 신(腎)은 위로 폐(肺)와 연(連)한다. 만약 폐기(肺氣)가 무권(無權)하면 신수(腎水)가 결국 섭(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160;<span style="color: #0000ff;">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를 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治</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려면 반드시 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를 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治</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여야 하고&#160;<span style="color: #0000ff;">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腎</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治</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려면 반드시 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肺</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를 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治</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여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인삼</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人蔘</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황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黃&#33450;</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당귀</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當歸</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백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白朮</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육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肉桂</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부자</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附子</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건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乾薑</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속(屬)으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그 연후에 병기(機)를 잘 살펴서(:相) 고삽(固澁)한 방제(劑)를 좌(佐)로 가하면 거의 근본(本)을 치(治)하는 도(道)를 얻어 근원(源)이 정도(度)로 흐르게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그렇지 않고 헛되이 광란(狂瀾: 세찬 물결)만 막으려고(:障) 한다면 결국에는 무익(無益)하게 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내가 제조(制)한&#160;<span style="color: #00cc00;">공제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鞏&#38532;丸</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처방(方)은&#160;<span style="color: #f200f2;">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心</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脾</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肺</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속(屬)을 막론(:無論)하고 치료(治)하니, 모두 이로 주치(主治)하여야 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200f2;">비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脾肺</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기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氣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수도(水道)를 약속(約束)하지 못하므로 불금(不禁)의 병(病)을 하면 이는 그 허물(:咎)이&#160;<span style="color: #f200f2;">중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中上</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이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二焦</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보중익기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補中益氣湯</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이중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理中湯</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온위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溫胃飮</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귀비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歸脾湯</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혹은 사미회양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四味回陽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에 고삽(固澁) 등의 제(劑)를 가하여 주(主)하여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만약 효과(效)를 보지 못하면 당연히&#160;<span style="color: #f200f2;">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을 책망(責)하여야 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200f2;">간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肝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양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휴패</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虧敗</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방광(膀胱)이 부장(不藏)하여 수천(水泉)이 부지(不止)한다. 이는 그 허물(:咎)이&#160;<span style="color: #f200f2;">명문</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命門</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에 있다.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우귀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右歸飮</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대보원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大補元煎</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육미회양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六味回陽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하여야 하고, 심(甚)하면&#160;<span style="color: #00cc00;">사유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四維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고삽(固澁)을 가하여 좌(佐)로 하여도 된다. 혹&#160;<span style="color: #00cc00;">집요사신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集要</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四神丸</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쓰거나&#160;<span style="color: #00cc00;">팔미지황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八味地黃丸</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에 택사</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澤瀉</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를 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去</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한 것도 쓸 수 있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0000ff;">수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睡中</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유뇨</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遺溺</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 이는 반드시&#160;<span style="color: #f200f2;">하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下元</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허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寒</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불고(不固)하기 때문이다.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대토사자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大&#33759;絲子丸</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가구자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家&#38893;子丸</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오자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五子丸</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축천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縮泉丸</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소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小兒</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가 유(幼)하므로 단속(:檢束)을 하지 않아 제멋대로(:縱肆) 항상 유(遺)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습관(:慣)이 되어 삼가지(:憚) 않는 것으로,&#160;<span style="color: #f200f2;">지의</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志意</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病</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다. 당연히 그&#160;<span style="color: #f200f2;">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神</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을 책망(責)하여야 하니, 약(藥)으로 미칠 바가 아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혹 종(縱)으로 인하여 불고(不固)하면 또한 당연히 앞과 같이 치(治)하여야 한다.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저</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猪</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나 양</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羊</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의 수포</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28338;&#33068;</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를 연하게(:脆) 자(炙)하고 전탕(煎湯)하여 앞의 약(藥)을 송하(送下)하면 더 묘(妙)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200f2;">공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恐懼</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로 인하여 갑자기 유(遺)하면 이는&#160;<span style="color: #f200f2;">심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心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부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不足</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데 하(下)로 간신(肝腎)과 연(連)하므로 그러한 것이다.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대보원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大補元煎</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귀비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歸脾湯</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오군자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五君子煎</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一. 고방(古方)에는&#160;<span style="color: #00cc00;">장양</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壯陽</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고삽</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固澁</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는 등의 제(劑)가 있다.&#160;<span style="color: #00cc00;">회양익지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茴香益智丸</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이기단</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二氣丹</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고포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固&#33068;丸</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비원단</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秘元丹</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모려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牡蠣丸</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제생토사자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濟生&#33759;絲子丸</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고진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固眞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에서 모두 마땅함을 따라 선택(擇)하여 사용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