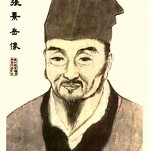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06. 구(嘔)를 치료(治)하는 기미(氣味)에 대한 논(論)</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19ff;">위허</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胃虛</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의 구토(嘔吐)를 치료(治)하려면 반드시 그 기미(氣味)를 매우 자세히 살펴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사기(邪)가 실(實)하여도 <span style="color: #f200f2;">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胃</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强</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독약(毒藥)을 승(勝)할 수 있으므로 기미(氣味)의 우열(優劣)을 막론(:無論)하고 모두를 수용(受容)할 수 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오직 <span style="color: #ff19ff;">위</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胃</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가 허</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虛</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하고 기</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氣</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가 약</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弱</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하면 적합 여부(:宜否)에 대한 변별(辨)이 있다. 특히 <span style="color: #ff19ff;">위허</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胃虛</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가 심</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甚</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하면 기미(氣味) 간의 관계(關係)가 더욱 중(重)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19ff;">기</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氣</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가 허</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虛</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하면 <span style="color: #0000ff;">불감지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堪之氣</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감당할 수 없는 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를 가장 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畏</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니, 성조(腥&#33226;)하여 모산(耗散)하는 기(氣)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곧 약간 향(香)하거나 약간 욱(郁)하거나 아울러 음식(飮食)의 기(氣)조차도 받을 수 없으니, 기타(其他)의 것도 알 수 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19ff;">위</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胃</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가 약</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弱</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하면 <span style="color: #0000ff;">불감지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堪之味</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감당할 수 없는 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를 가장 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畏</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니, 지고(至苦) 극열(極劣)한 미(味)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곧 약간 함(鹹)하거나 약간 고(苦)하거나 아울러 오곡(五穀)의 정미(正味)조차도 받을 수 없으니, 기타(其他)의 것도 알 수 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처럼 <span style="color: #f200f2;">위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胃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구(嘔)는 기미(氣味)가 가장 중(重)하니, 혹 약간이라도 투(投)할 수 없는 것을 구(口)에 넣으면 바로 토(吐)하므로, 결국 무익(無益)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따라서 <span style="color: #ff19ff;">양허</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陽虛</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의 구토(嘔吐) 등의 증(證)을 치료(治)하려면 일체(一切)의 향산(香散)하거나 함산(鹹酸)하거나 신미(辛味) 등의 감당(堪)할 수 없는 물질(物)을 마땅히 자기의 마음으로 추측(:測)하여야 하니, 추측(:測)하여 타당(:妥)하지 않으면 결코 쓰면 안 된다. 단지 그 <span style="color: #00cc00;">양</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陽</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을 보</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하니, 양(陽)이 회(回)하면 구(嘔)가 반드시 저절로 그치느니라. 이는 가장 확실(:確)한 법(法)이니 이를 소홀(忽)히 하면 안 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내가 예전에 어떤 심씨(沈氏)를 보았느니라. 그는 평소 의업(醫業)을 하면서 <span style="color: #f200f2;">극</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極</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히 많이 노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勞碌</span>: 힘써 일하다)하였으니, 나이가 40세(:四旬)에 이르러 <span style="color: #0000ff;">퇴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16343;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의 하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下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를 앓았느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로 인하여 이를 제(提)하여 상승(上升)시키려고, &#39;<span style="color: #ff19ff;">위</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胃</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가 허</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虛</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하면 함(鹹)을 외(畏)한다.&#39;는 것은 모르면서 스스로 염탕(鹽湯)으로 <span style="color: #834d00;">토법</span><span style="color: #834d00;">(</span><span style="color: #834d00;">吐法</span><span style="color: #834d00;">)</span>을 썼느니라. 결국 <span style="color: #0000ff;">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그치지 않고 탕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湯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까지 모두 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하기를 일일(一日) 일야(一夜)를 하다가 <span style="color: #0000ff;">갑자기 대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大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으로 흑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黑血</span><span style="color: #0000ff;">) 1~2</span><span style="color: #0000ff;">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碗</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下</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서 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은 모</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와 같이 미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微渺</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거의 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絶</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는 듯 하였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는 토(吐)로 <span style="color: #ff19ff;">위기</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胃氣</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를 상</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傷</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하였으므로 <span style="color: #ff19ff;">비</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脾</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가 극히 허</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span style="color: #ff19ff;">虛</span><span style="color: #ff19ff;">)</span>하고, 겸하여 염탕(鹽湯)이 혈(血)로 주(走)하므로 혈(血)이 섭(攝)하지 못하여 <span style="color: #0000ff;">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으로 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下</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는 것이었다. 내가 지시하기를 &#39;속히 <span style="color: #00cc00;">인삼</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人蔘</span><span style="color: #00cc00;">) </span><span style="color: #00cc00;">건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乾薑</span><span style="color: #00cc00;">) </span><span style="color: #00cc00;">부자</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附子</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 등의 방제(劑)를 써서 수절(垂絶: 응급)한 <span style="color: #00cc00;">양</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陽</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을 회복</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回</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시켜야 치료(:療)할 수 있다.&#39; 말하였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그런데 갑자기 어떤 의사(醫)가 와서 이르기를 &#39;제역(諸逆) 충상(衝上)은 모두 화(火)에 속(屬)하니, 대변(大便)의 하혈(下血)도 화(火)로 인한다. 그런데 인삼(人蔘) 부자(附子)의 사용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마땅히 속히 동변(童便)을 음(飮)하여야 구(嘔)가 나을 수 있고 혈(血)도 그칠 수 있다.&#39; 하였다. 그가 그 의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span style="color: #834d00;">동변</span><span style="color: #834d00;">(</span><span style="color: #834d00;">童便</span><span style="color: #834d00;">)</span>을 하인(下咽)하였더니, 즉시 <span style="color: #0000ff;">극</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게 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그 모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이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名</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기가 감당할 수 없었으며</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그치지 않으니 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겨우 이어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繼</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뿐</span>이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오호라! 위(胃)가 강(强)한 사람도 또한 요(尿)를 문(聞)하면 구(嘔)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구(嘔)가 그치지 않는데 다시 요(尿)를 더할 수 있겠는가? 이로 죽는 자도 불쌍(:憐)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함부로 쓰는 자도 감히 의사(醫)라고 칭(稱)하다니, 진실로 부끄럽고도(:惡) 한탄(恨)스럽도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하여 이로 기미(氣味)에 대하여 증험(證驗)하였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또 기미(氣味)에 대한 치안(治按)이 소아({小兒})의 문(門) 구토(&lt;嘔吐&gt;)의 조(條)에 있으니, 마땅히 참작(參酌)할지니라.</span></p>
<!-- -->
카페 게시글
잡증모04 (19-21)
06. 구(嘔)를 치료(治)하는 기미(氣味)에 대한 논(論)
코코람보
추천 0
조회 7
24.01.30 08:1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