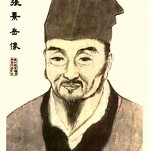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43.&#160;소산(小産)</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span data-ke-size="size18">소산(小産: 유산)의 증(證)에는&#160;<span style="color: #f200f2;">경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輕重</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 있고&#160;<span style="color: #f200f2;">원근</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遠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 있으며&#160;<span style="color: #f200f2;">품부</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稟賦</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가 있고&#160;<span style="color: #f200f2;">인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人事</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가 있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품부</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稟賦</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로 말미암으면 대부분&#160;<span style="color: #f200f2;">허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160;때문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인사</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人事</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로 말미암으면 대부분&#160;<span style="color: #f200f2;">손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損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160;때문이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정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正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숙(熟)하여 낙(落)하는 자연스러운(自然) 출산(:出)이고,&#160;<span style="color: #ff0000;">소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小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손절(損折)로 말미암은 면강(勉强)의 출산(:出)이니, 이로 소산(小産)을 무시하면 안 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연력</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年力</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나이나 체력</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고&#160;<span style="color: #f200f2;">산육</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産育</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많았는데</span>&#160;이를 다시 진(振)하고 고(固)하려는 것은 어려우니라. 이것이 나타나면 단지 그&#160;<span style="color: #00cc00;">모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母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를 보</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保</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는 것이 최선(:善)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소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少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신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愼</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지 않아</span>&#160;소산(小産)하게 되면 이 때도&#160;<span style="color: #00cc00;">조리</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調理</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下次)의 임기(臨期)에도 거듭(:仍然) 추(墜)하게 되고 이차(二次) 삼차(三次)에 이르게 되면 결국 자사(子嗣)가 어렵게 된다. 이와의 관계(係)가 작지 않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이를 안(安)하는 법(法)은 앞의 삭타태(&lt;數墮胎&gt;)의 조(條)에 나온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산(産)의 조리법(調理法)도 또한&#160;<span style="color: #ff0000;">대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大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과 상사(相似)하니, 후의 산후(&lt;産後&gt;)의 조(條)에 상세히 나오니, 모두 당연히 같이 살펴서 써야 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一. 부인(婦人)이 중년(中年)이 되어&#160;<span style="color: #f200f2;">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므로 태원(胎元)이 무력(無力)하면 항상 태(胎)가 장(長)하지 못하고 소산(小産) 혼훈(昏暈)의 질환(:患)이 많게 되니, 이는&#160;<span style="color: #f200f2;">기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氣血</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쇠패</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衰敗</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그러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혈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血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이미 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였으면 소산(小産)하여 태(胎)가 이미 낙(落)하였는데도, 마치 일태(一胎)가 있어서 산(産)하려는 것 같이 다시 또 하추(下墜)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는 태(胎)가 아니라&#160;<span style="color: #f200f2;">기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氣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로 인하여 포궁(胞宮)이 태(胎)를 따라 하함(下陷)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산모(産母)가 이를 잘 모르면 반드시 경황(驚慌)하게 되니, 이는 족히 염려(:慮)할 바가 아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다만&#160;<span style="color: #00cc00;">수비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壽脾煎</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이나 팔진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八珍湯</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십전대보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十全大補湯</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궁귀보중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芎歸補中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로 주(主)하면 저절로 안(安)하게 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또 소산(小産)에는&#160;<span style="color: #ff0000;">원근</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遠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있으니,&#160;<span style="color: #0000ff;">2</span><span style="color: #0000ff;">개월&#160;</span><span style="color: #0000ff;">3</span><span style="color: #0000ff;">개월에 있으면&#160;</span><span style="color: #ff0000;">근</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고,&#160;<span style="color: #0000ff;">5</span><span style="color: #0000ff;">개월&#160;</span><span style="color: #0000ff;">6</span><span style="color: #0000ff;">개월에 있으면&#160;</span><span style="color: #ff0000;">원</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遠</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00ff;">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게 수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受</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 그 세(勢)가&#160;<span style="color: #ff0000;">경</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輕</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160;<span style="color: #0000ff;">회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懷</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 그 세(勢)가&#160;<span style="color: #ff0000;">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重</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한다. 이는 모두 사람들이 아는 것이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근(近)에 있어서는 잉(孕)하는 대로 산(産)하기도 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요즘 후사(:嗣)가 힘든(:艱) 집안(:家)에서는 이를 범(犯)하는 경우가&#160;<span style="color: #0000ff;">50~60%&#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차지하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居</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그 연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는 결국&#160;</span><span style="color: #f200f2;">종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縱慾</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다만 본래 사람이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도 않으니, 이에 삼가 글(:筆)로 등(燈)을 대신(代)하여 지미(指迷)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후인(後人)을 제(濟)하려고 하니, 이는 실로 심대(深)한 소원(願)으로 청(請)하건대, 이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려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태원</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胎元</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시작(:始肇)에서 1개월은 주로(珠露)와 같고, 2개월은 도화(桃花)와 같으며, 3개월 4개월의 후이면 혈맥(血脈) 형체(形體)가 갖추어지고, 5개월 6개월 후이면 근골(筋骨) 모발(毛髮)이 생(生)하게 된다. 즉 막 초수(初受)하면 한 방울(:一滴)의 현진(玄津: 현묘한 진액)에 불과(不過)할 뿐이다. 이 탁약(&#27094;&#31845;: 생명체)은 정히 의(依)할 바가 없고 그 근해(根&#33604;)가 아직 바탕(:地)이 없으니, 이를 묶어주면(:鞏) 고(固)하게 되고, 터지게 하면(:決) 유(流)하게 된다. 따라서 수태(受胎)한 후에는 극(極)히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절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節慾</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 범일(泛溢)을 방지(:防)하여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그러나 소년(少年)의 때에는&#160;<span style="color: #00cc00;">종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縱情</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는 것을 꺼려야(:忌憚)함을 알지 못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태(胎)가 고(固)하고 욕(慾)이 경(輕)하면 보전(保全)을 많이 할 수 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만약 사람이 용(勇)을 겸하거나, 강(强)함을 믿고(:恃) 물러서지(:敗) 않거나, 패(敗)하여도 다시 전(戰)하게 되면 이 때에는 주(主: 여자)는 막 정(靜)하려고 하지만 객(客: 남자)이 휴(休)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마치 어찌 할 수 없는(:無奈) 미친 무리들(:狂徒)이 문호(門戶)를 마구 두드리면서 치는(:敲撞) 것과 같게 된다. 이로 보건대(:顧), 수성(水性)의 열장(熱腸: 태아)은 문(:扉)을 열지 않아도 그 유(流)를 따라 떠나가지(:逝) 않겠는가? 이 때는 낙화(落花)와 나비(:粉蝶)가 같이 날아가고, 화조(火棗)와 교리(交梨)를 같이 잃게 되니(:逸), 오(汚)와 합하여 같이 유(流)하게 된다. 작일(昨日)에 잉(孕)하였는데 금일(今日)에 산(産)하고, 삭일(朔日)에 잉(孕)하였는데 망일(望日)에 산(産)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잉(孕)하는 대로 산(産)하면 본래 형적(形迹)이 없다.&#160;<span style="color: #ff0000;">명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明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태(胎)가 이미 형(形)을 이루고 소산(小産)하여도 반드시 느끼지만,&#160;<span style="color: #ff0000;">암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暗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태(胎)가 수(水)와 같아서 바로 흘러내리니(:溜) 어떻게 알겠는가?</span></p><p><span data-ke-size="size18">따라서 요즘의 화류계(&#17941;&#17941;家:항항가)에서는 대부분 대산(大産)이 없으니, 이는 소산(小産)이 많기 때문이다. 창기(娼妓)에게 장가든 자는 대부분 자식(子息)이 적으니,&#160;<span style="color: #f200f2;">자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子宮</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습관적으로(:慣) 소산(小産)하기 때문이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요즘 보건대, 사(嗣)가 어려워(:艱) 방법(:方)을 구하는 자들에게&#160;<span style="color: #ff0000;">양사</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陽事</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에 대해 문(問)하면 &#39;잘 한다.&#39;고 하고&#160;<span style="color: #ff0000;">공부</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功夫</span><span style="color: #ff0000;">:&#160;</span>방중술)에 대해 문(問)하면 &#39;다 안다.&#39; 하며&#160;<span style="color: #ff0000;">의황</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意況</span><span style="color: #ff0000;">:&#160;</span>마음의 정황)에 대해 문(問)하면 원탄(怨嘆: 한탄하다)하며 이르기를 &#39;남들은 모두 자식이 있는데, 나만 없다.&#39;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다른 사람은 명산(明産)이고 자기는 암산(暗産)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이 외(外)에, 수태(受胎)한지 3개월, 5개월에 매번 타(墮: 유산)하는 경우는&#160;<span style="color: #f200f2;">쇠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衰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 부(婦)에게는 늘 있겠지만,&#160;<span style="color: #f200f2;">종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縱慾</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부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不節</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로 말미암아&#160;<span style="color: #f200f2;">모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母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를 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타(墮)하는 경우가 특히 많다. 따라서 강(强)을 믿고 용(勇)이 과(過)한 자는 대부분 무자(無子)하니, 강(强)과 약(弱)이 서로 잔(殘)하기 때문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종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縱肆</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마음대로 방종하다</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부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不節</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대부분 육(育)하지 못하니,&#160;<span style="color: #f200f2;">태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胎元</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를 도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盜損</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은밀히 손상하다)하였기 때문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어찌 모두 부인(婦人)의 죄(罪)로만 말미암겠는가?</span></p><p><span data-ke-size="size18">나에게 방법(:方)을 구하려는 자가 먼저 이 책(:篇)을 읽는다면 방(方)을 전(傳)하려는 사고(思)의 반(半)은 이미 넘어간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43-1)&#160;소산(小産)의 론(論)&#160;외의 처방(方)</span></p><p><span data-ke-size="size18">人蔘黃&#33450;湯 婦四八: 小産氣虛血不止 當歸川芎湯 婦四三: 小産瘀血痛</span></p><p><span data-ke-size="size18">殿胞煎 新因十: 小産後腹痛</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
<!-- -->
카페 게시글
부인규 (38-39)
43. 소산(小産)
코코람보
추천 0
조회 123
24.01.31 11:4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