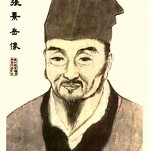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18.&#160;관농(灌膿)하는 삼조(三朝)의 길흉(吉凶)을 변(辨)하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두(痘)가 기발(起發)한 후부터 작은 것이 점차 커지고 평(平)하던 것이 점차 고(高)하며, 함(陷)한 것이 점차 기(起)하고 외(外)로 미홍(微紅)을 대(帶)하면서 내(內)로 청장(淸漿)을 함(涵)한다. 관농(灌膿)할 시(時)까지는 그 요(要)는 개개(個個)가 농(膿)이 되고 근각(根脚)이 홍활(紅活)하며, 그 형(形)은 원만(圓滿) 광택(光澤)하여야 한다. 이 시(時)에는 독(毒)이 화(化)하여 장(漿)이 되니, 녹색(綠色)에서 점차 변(變)하여 창랍(蒼蠟)하고 손으로 만지면 그 피(皮)가 견경(堅硬)하며, 농(膿)의 장(漿)이 후탁(厚濁)하고 약속(約束)함이 완고(完固)하며, 적은 파손(破損)도 없고 음식(飮食) 이변(二便)이 여상(如常)한다. 이는 가장 길(吉)한 후(候)이니, 복약(服藥)할 필요가 없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두(痘)가 밀(密)하면 기(起)에서 장(漿)까지 점차 장대(壯大)하여 서로 관(串)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서로 연속(連屬)하여도, 오직 요(要)는 근각(根脚)이 분명(分明)하고 함(陷)한 것은 다 기(起)하며, 투(透)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다. 독(毒)이 장(漿)으로 화(化)하여 농(膿)이 되면서 독(毒)이 저절로 풀리고 복류(伏留)하는 것이 없으니, 이도 또한 길(吉)한 후(候)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두(痘)가 처음에 출(出)할 때 정(頂)이 평(平)하거나, 중심(中心)이 함하(陷下)하거나, 백색(白色)이어도, 오직 요(要)는 그 사람이 능식(能食)하고 이변(二便)이 여상(如常)하면 치(治)하여도 잘못(:乖謬)되지 않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관농(灌膿)할 시(時)에 이르러, 함(陷)은 미(微)하게 기(起)하고 평(平)은 미(微)하게 첨(尖)하며, 담백(淡白)은 홍활(紅活)하면서 과(&#31392;) 중의 혈수(血水)가 모두 화(化)하여 농(膿)이 되니, 단지 이와 같으면 독(毒)은 이미 풀린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또 표(表)에 통양(痛&#30306;)의 증(證)이 없고 리(裏)에 토사(吐瀉)의 증(證)이 없다면, 이는 표리(表裏)가 모두 병(病)이 없는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이와 같다면 좌(坐)하여 수엽(收&#38760;)을 기다려야 하니, 탕제(湯劑)를 함부로 투여(投)하면 안 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관농(灌膿)할 시(時)에 홍자(紅紫) 흑색(黑色)으로 외박(外剝) 성아(聲啞)하면 사(死)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관(灌)할 시(時)에 순전히 청수(淸水)이고 피(皮)가 박(薄)하면서 백(白)하여 수포(水泡)와 같으면, 3~4일에 반드시 조파(&#25235;破)하면서 사(死)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농(膿)이 관(灌)하지 못하고 건고(乾枯) 초흑(焦黑)하거나, 전적으로 혈수(血水)가 없이 탑함(&#22604;陷)하면 바로 사(死)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두면(頭面)이 종대(腫大)하고 창(瘡)을 모두 소파(搔破)하면 취(臭)하여 가까이 할 수 없으면서 족냉(足冷)하면 결사(決死)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관농(灌膿)할 시(時)에 토리(吐利)가 부지(不止)하고 혹 이변(二便)이 하혈(下血)하며, 유식(乳食)이 불화(不化)하고 두(痘)가 난(爛)하며 농(膿)이 없으면 결사(決死)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관농(灌膿)할 시(時)에 이변(二便)이 불통(不通)하고 복창(腹脹)하며, 육(肉)이 흑(黑)하면서 발반(發斑)하고 섬망(&#35691;妄) 기천(氣喘)하거나, 한전(寒戰)으로 교아(咬牙)하면 결사(決死)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회장(回漿)할 시(時)에 점차 창흑(蒼黑)으로 수렴(收斂)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광눈(光嫩)하여 불렴(不斂)하면, 이는 기혈(氣血)이 양허(兩虛)하여 장(漿)이 건(乾)하지 못한 것이니, 반드시 발양(發&#30306;)하여 소파(搔破)하면 사(死)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농장(膿漿)이 미성(未成)한데 홀연(忽然)히 건수(乾收)하거나, 청자(靑紫) 초흑(焦黑)하면 사(死)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홀연(忽然)히 양(&#30306;)을 작(作)하여, 바로 면(面)을 조파(&#25235;破)하면 피(皮)가 탈(脫)하고 육(肉)이 건(乾)하면 사(死)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제두(諸痘)에는 장(漿)이 있지만 천정(天庭)에는 불기(不起)하고, 혹 액상(額上)에 마치 비탕(沸湯)으로 요(&#28550;)한 듯 파(破)하며, 취(臭)가 양협(兩頰)으로 연(連)하고, 수(水)가 거(去)하면서 건(乾)하며, 엽(&#38760;)가 비슷한데 엽(&#38760;)은 아니면 사(死)한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
<!-- -->
카페 게시글
두진전 (42-45)
18. 관농(灌膿)하는 삼조(三朝)의 길흉(吉凶)을 변(辨)하다
코코람보
추천 0
조회 3
24.01.31 14:51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