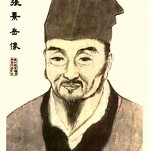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01. 내경(經)의 정의(義)</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span data-ke-size="size18">음양응상대론(&lt;陰陽應象大論&gt;)에 이르기를 &quot;양(陽)이 쌓이면(:積) 천(天)이 되고, 음(陰)이 쌓이면(:積) 지(地)가 된다. 음(陰)은 정(靜)하고, 양(陽)은 조(躁)하다. 양(陽)은 생(生)하고, 음(陰)은 장(長)한다. 양(陽)은 살(殺)하고, 음(陰)은 장(藏)한다. 양(陽)은 기(氣)로 변화(化)하고, 음(陰)은 형(形)을 형성(成)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한(寒)이 극(極)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생(生)하고, 열(熱)이 극(極)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생(生)한다. 한기(寒氣)는 탁(濁)을 생(生)하고 열기(熱氣)는 청(淸)을 생(生)한다. 청기(淸氣)가 하(下)에 있으면 손설(&#39153;泄)을 생(生)하고, 탁기(濁氣)가 상(上)에 있으면 진창(&#17436;脹)을 생(生)한다. 이는 음양(陰陽)이 반대(反)로 작(作)하는 것이니, 병(病)의 역종(逆從)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양(陽)이 승(勝)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음(陰)이 승(勝)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다. 중한(重寒)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중열(重熱)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다.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형(形)을 상(傷)하고,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기(氣)를 상(傷)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풍(風)이 승(勝)하면 동(動)하고,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승(勝)하면 종(腫)하며, 조(燥)가 승(勝)하면 건(乾)하고,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승(勝)하면 부(浮)하며, 습(濕)이 승(勝)하면 유설(濡泄)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희로(喜怒)는 기(氣)를 상(傷)하고, 한서(寒暑)는 형(形)을 상(傷)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동(冬)에 한(寒)에 상(傷)하면 춘(春)에 반드시 온병(溫病)을 하고, 춘(春)에 풍(風)에 상(傷)하면 하(夏)에 손설(&#39153;泄)을 생(生)하며, 하(夏)에 서(暑)에 상(傷)하면 추(秋)에 반드시 해학(&#30158;&#30247;)을 하고, 추(秋)에 습(濕)에 상(傷)하면 동(冬)에 해수(咳嗽)가 생(生)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양(陽)이 승(勝)하면 신(身)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주리(&#33120;理)가 개(開)하며, 천조(喘粗)하여 면앙(&#20443;仰)하게 되고, 한(汗)이 나지 않으면서(:不出) 열(熱)하고 치(齒)가 건(乾)하게 된다. 번원(煩寃)하고 복만(腹滿)하면 죽는데, 동(冬)에는 능(能)하나 하(夏)에는 능(能)하지 못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음(陰)이 승(勝)하면 신(身)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한(汗)이 나면서 신(身)이 항상 청(淸)하며, 자주 율(慄)하면서 한(寒)하다. 한(寒)하면 궐(厥)하게 되고 궐(厥)하면 복만(腹滿)하여 죽는데, 하(夏)에는 능(能)하나 동(冬)에는 능(能)하지 못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천(天)의 사기(邪氣)에 감(感)하면 사람의 오장(五藏)을 해(害)하고, 수곡(水穀)의 한열(寒熱)에 감(感)하면 육부(六府)를 해(害)하며, 지(地)의 습기(濕氣)에 감(感)하면 피육(皮肉) 근맥(筋脈)을 해(害)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천원기대론(&lt;天元紀大論&gt;)에서 이르기를 &quot;신(神)이 천(天)에서는 풍(風)이면 지(地)에서는 목(木)이며, 천(天)에서는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면 지(地)에서는 화(火)이며, 천(天)에서는 습(濕)이면 지(地)에서는 토(土)이며, 천(天)에서는 조(燥)이면 지(地)에서는 금(金)이며, 천(天)에서는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면 지(地)에서는 수(水)이다. 따라서 천(天)에서는 기(氣)가 되고 지(地)에서는 형(形)을 이루니, 형(形)과 기(氣)가 서로 감(感)하여 만물(萬物)을 화생(化生)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오운행대론(&lt;五運行大論&gt;)에 이르기를 &quot;상하(上下)가 서로 만나(:&#36952;) <span style="color: #ff0000;">한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서로 임(臨)하니, 기(氣)가 상득(相得)하면 화(和)하고, 기(氣)가 상득(相得)하지 못하면 병(病)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백병시생편(&lt;百病始生篇&gt;)에 이르기를 &quot;풍우(風雨)나 <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도 허(虛)를 얻지 못하면 사기(邪)가 홀로 사람을 상(傷)하게 하지는 못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사기조신론(&lt;四氣調神論&gt;)에 이르기를 &quot;춘기(春氣)는 생(生)을 양(養)하는 도(道)에 응(應)하니, 이에 역(逆)하면 간(肝)을 상(傷)하여 하(夏)가 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으로 변(變)하니, 장(長)을 봉(奉)하는 것이 적게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하기(夏氣)는 장(長)을 양(養)하는 도(道)에 응(應)하니, 이에 역(逆)하면 심(心)을 상(傷)하여 추(秋)가 되면 해학(&#30158;&#30247;)이 되니, 수(收)를 봉(奉)하는 것이 적게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추기(秋氣)는 수(收)를 양(養)하는 도(道)에 응(應)하니, 이에 역(逆)하면 폐(肺)를 상(傷)하여 동(冬)이 되면 손설(&#39153;泄)이 되니 장(藏)을 봉(奉)하는 것이 적게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동기(冬氣)는 장(藏)을 양(養)하는 도(道)에 응(應)하니, 이에 역(逆)하면 신(腎)을 상(傷)하니 춘(春)이 되면 위궐(&#30207;厥)하며 생(生)을 봉(奉)하는 것이 적게 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금궤진언론(&lt;金&#21297;眞言論&gt;)에 이르기를 &quot;장하(長夏)에는 통설(洞泄) 한중(寒中)을 곧잘 병(病)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기교변대론(&lt;氣交變大論&gt;)에 이르기를 &quot;세목(歲木)이 태과(太過)하면 풍기(風氣)가 유행(流行)하여 비토(脾土)가 사기(邪)를 받는다. 세화(歲火)가 태과(太過)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염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炎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유행(流行)하여 금폐(金肺)가 사기(邪)를 받는다. 세토(歲土)가 태과(太過)하면 우습(雨濕)이 유행(流行)하여 신수(腎水)가 사기(邪)를 받는다. 세금(歲金)이 태과(太過)하면 조기(燥氣)가 유행(流行)하여 간목(肝木)이 사기(邪)를 받는다. 세수(歲水)가 태과(太過)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유행(流行)하여 사기(邪)가 심화(心火)를 해(害)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세목(歲木)이 불급(不及)하면 조(燥)가 대행(大行)하고 생기(生氣)의 응(應)을 실(失)한다. 세화(歲火)가 불급(不及)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대행(大行)하고 장정(長政)을 쓰지 못한다. 세토(歲土)가 불급(不及)하면 풍(風)이 이에 대행(大行)하고 화기(化氣)가 영(令)하지 못한다. 세수(歲水)이 불급(不及)하면 습(濕)이 이에 대행(大行)하고 장기(長氣)의 용(用)에 반(反)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선명오기편(&lt;宣明五氣篇&gt;)에 이르기를 &quot;심(心)은 열(熱)을 오(惡: 싫어하다)하고 폐(肺)는 한(寒)을 오(惡)하며 간(肝)은 풍(風)을 오(惡)하고 비(脾)는 습(濕)을 오(惡)하며 신(腎)은 조(燥)를 오(惡)한다. 이를 오오(五惡: 5가지 싫어함)라고 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경맥편(&lt;經脈篇&gt;)에 이르기를 &quot;폐(肺)에서의 소생병(所生病: 그 자리에서 생하는 병)은 해(咳) 상기(上氣) 천갈(喘喝) 번심(煩心) 흉만(胸滿)하고 노비(&#33233;臂) 내측(:內) 전렴(前廉)이 통궐(痛厥)하며 장중(掌中)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다. 기(氣)가 성(盛)하여 유여(有餘)하면 견배(肩背)가 통(痛)하고 풍한(風寒)으로 한출(汗出)하는 중풍(中風)과 소변(小便)이 삭(數)하면서 흠(欠: 적다)한다. 기(氣)가 허(虛)하면 견배(肩背)가 통(痛)하면서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소기(少氣)하여 식(息)하기에 부족(不足)하며 뇨(溺)의 색(色)이 변(變)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대장(大腸)의 소생병(所生病)에서 기(氣)가 유여(有餘)하면 맥(脈)이 지나가는 곳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서 종(腫)하고 허(虛)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률</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慄</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서 회복(復)이 잘 안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위(胃)의 소생병(所生病)에서 기(氣)가 성(盛)하면 신(身)의 앞쪽이 모두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위(胃)가 유여(有餘)하면 소곡(消穀) 선기(善飢)하고 뇨(溺)의 색(色)이 황(黃)하며, 기(氣)가 부족(不足)하면 신(身)의 앞 쪽이 모두 <span style="color: #ff0000;">한률</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慄</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며, 위중(胃中)이 한(寒)하면 창만(脹滿)하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심(心)에서의 소생병(所生病)은 목황(目黃) 협통(脇痛)하고 노비(&#33233;臂) 내측(:內) 후렴(後廉)이 통궐(痛厥)하며 장중(掌中)이 <span style="color: #ff0000;">열통</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痛</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신(腎)에서의 소생병(所生病)은 구열(口熱) 설건(舌乾) 인종(咽腫) 상기(上氣)하고 익(&#21964;)이 건(乾)하면서 통(痛)하며 번심(煩心) 심통(心痛)하고 황달(黃疸) 장벽(腸&#28604;)하며 척고(脊股) 내측(:內) 후렴(後廉)이 통(痛)하고 위궐(&#30207;厥) 기와(嗜臥)하며 족하(足下)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서 통(痛)하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심주(心主)에서의 소생병(所生病)은 면적(面赤) 목황(目黃)하고 희소(喜笑)가 불휴(不休)하며 번심(煩心) 심통(心痛)하고 장중(掌中)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담(膽)에서의 소생병(所生病)은 족(足)의 외측(:外)이 도리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두통(頭痛) 함통(&#38967;痛)하며 목(目)의 예자(銳&#30501;)가 통(痛)하고 결분(缺盆) 액하(腋下)가 종통(腫痛)하며 마도협영(馬刀俠&#30317;)하고 한출(汗出) 진한(振寒)하며 학(&#30247;)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기궐론(&lt;氣厥論&gt;)에 이르기를 &quot;신(腎)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비(脾)로 이(移)하면 옹종(癰腫) 소기(少氣)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비(脾)가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간(肝)으로 이(移)하면 옹종(癰腫) 근련(筋攣)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간(肝)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심(心)으로 이(移)하면 광(狂) 격중(隔中)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심(心)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폐(肺)로 이(移)하면 폐소(肺消)하니, 폐소(肺消)는 일(一)을 음(飮)하고 이(二)를 수(&#28338;)하는데, 곧 사(死)하여 불치(不治)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폐(肺)가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신(腎)으로 이(移)하면 용수(湧水)가 된다. 용수(湧水)는 복(腹)을 안(按)하면 견(堅)하지 않고 수기(水氣)가 대장(大腸)에 객(客)한 것이니, 빨리 걸으면(:行) 마치 낭(囊)이 장(漿)을 싼(:&#35065;) 것 같이 소리(:鳴)가 출렁출렁(:濯濯)거리는데, 수(水)의 병(病)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비(脾)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간(肝)으로 이(移)하면 경(驚) 뉵(&#34884;)이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간(肝)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심(心)으로 이(移)하면 죽는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심(心)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폐(肺)로 이(移)하면 전(傳)하여 격소(膈消)가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폐(肺)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신(腎)으로 이(移)하면 전(傳)하여 유치(柔&#30163;)가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신(腎)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비(脾)로 이(移)하면 전(傳)하여 장벽(腸&#28604;)이 되니, 사(死)하여 치(治)할 수 없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포(胞)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방광(膀胱)으로 이(移)하면 륭(&#30275;) 뇨혈(溺血)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방광(膀胱)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소장(小腸)으로 이(移)하면 격장(膈腸)이 불편(不便)하고 상(上)으로는 구미(口&#31964;)가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소장(小腸)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대장(大腸)으로 이(移)하면 복가(&#34393;&#30229;)가 되고 침(沈)이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대장(大腸)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위(胃)로 이(移)하면 선식(善食)하나 수(瘦)하니, 이를 식역(食&#13386;)이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위(胃)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담(膽)으로 이(移)하면 이 또한 식역(食&#13386;)이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담(膽)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뇌(腦)로 이(移)하면 신알(辛&#38942;) 비연(鼻淵)한다. 비연(鼻淵)은 탁체(濁涕)가 하(下)하여 부지(不止)하며 전(傳)하여 뉵멸(&#34884;蔑) 명목(瞑目)이 된다. 따라서 이는 기궐(氣厥)에서 얻는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수요강유편(&lt;壽夭剛柔篇&gt;)에 이르기를 &quot;풍한(風寒)은 형(形)을 상(傷)하고 우공(憂恐) 분노(忿怒)는 기(氣)를 상(傷)한다. 기(氣)는 장(臟)을 상(傷)하니 장(臟)이 병(病)하고,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형(形)을 상(傷)하니 형(形)이 이에 응(應)한다. 풍(風)은 근맥(筋脈)을 상(傷)하니 근맥(筋脈)이 이에 응(應)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해론(&lt;咳論&gt;)에 이르기를 &quot;피모(皮毛)는 폐(肺)의 합(合)이다. 피모(皮毛)가 먼저 사기(邪氣)를 받으니 사기(邪氣)는 합(合)인 곳으로 간다. 만약 한(寒)한 음식(飮食)이 위(胃)로 들어가면 폐맥(肺脈)을 따라 상(上)으로 폐(肺)에 이르니 폐(肺)가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게 되고, 폐(肺)가 한(寒)하면 외내(外內)로 합(合)한 사기(邪)가 객(客)하니 폐해(肺咳)가 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자지론(&lt;刺志論&gt;)에 이르기를 &quot;기(氣)가 허(虛)한데 신(身)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는 경우 이를 반(反)이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氣)가 성(盛)한데 신(身)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한 경우 이는 상한(傷寒)으로 얻은 것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氣)가 허(虛)한데 신(身)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한 경우 이는 상서(傷暑)로 얻은 것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氣)가 실(實)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기(氣)가 허(虛)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조경론(&lt;調經論&gt;)에 이르기를 &quot;혈기(血氣)는 온(溫)을 좋아하고 한(寒)을 싫어한다.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삽(泣)하여 흐를(:流) 수 없고 <span style="color: #ff0000;">온</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溫</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소(消)하여 잘 나아간다(去).</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한습(寒濕)이 사람을 상(傷)하는 것은 어떠한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백(岐伯)이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한습</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濕</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사람을 중(中)하면 피부(皮膚)가 불수(不收)하고 기육(肌肉)이 견긴(堅緊)하며, 영혈(榮血)이 삽(泣)하고 위기(衛氣)가 거(去)하므로, 이를 허(虛)라고 한다. 허(虛)란 섭벽(&#32886;&#36767;: 주름이 져서 쭈글쭈글하다)하고 기(氣)가 부족(不足)한 것인데, 누르면 기(氣)가 족(足)하여 온(溫)하게 되므로 쾌연(快然)하면서 통(痛)하지 않게 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음(陰)이 허(虛)를 생(生)하는 것은 어떠한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희(喜)하면 기(氣)가 하(下)하고 비(悲)하면 기(氣)가 소(消)하며 소(消)하면 맥(脈)이 허공(虛空)하게 된다. 이에 한(寒)한 음식(飮食)으로 인하여 한기(寒氣)가 훈만(熏滿)하면 혈(血)이 삽(泣)하고 기(氣)가 거(去)하므로, 이를 허(虛)라고 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양(陽)이 허(虛)하면 외(外)가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한데 왜 그러한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양(陽)이란 상초(上焦)에서 기(氣)를 받아 피부(皮膚) 분육(分肉)의 사이를 온(溫)하게 한다. <span style="color: #ff0000;">한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외(外)에 있으면 상초(上焦)가 불통(不通)하고, 상초(上焦)가 불통(不通)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외(外)에 홀로 유(留)하므로 <span style="color: #ff0000;">한률</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慄</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음(陰)이 허(虛)하면 내(內)에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생(生)하는데 왜 그러한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노권(勞倦)으로 형기(形氣)가 쇠소(衰少)하고 곡기(穀氣)가 성(盛)하지 않으면 상초(上焦)가 불행(不行)하고 하완(下脘)이 불통(不通)하여 위기(胃氣)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게 되며, <span style="color: #ff0000;">열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흉중(胸中)을 훈(熏)하므로, 내(內)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게 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양(陽)이 성(盛)하면 외(外)에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생(生)하는데, 왜 그러한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상초(上焦)가 통리(通利)하지 못하면 피부(皮膚)가 치밀(緻密)하고 주리(&#33120;理)가 폐색(閉塞)하며, 현부(玄府)가 불통(不通)하고 위기(衛氣)가 설월(泄越)하지 못하므로, 외(外)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게 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음(陰)이 성(盛)하면 내(內)에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생(生)하는데, 왜 그러한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궐기(厥氣)가 상역(上逆)하니, 한기(寒氣)가 흉중(胸中)에 쌓여(:積) 나가지(:瀉) 못하고, 나가지(:瀉) 못하면 온기(溫氣)가 거(去)하면서 한(寒)이 홀로 유(留)하니, 혈(血)이 응삽(凝泣)하고, 응(凝)하면 맥(脈)이 불통(不通)하여 그 맥(脈)이 성대(盛大)하면서 삽(泣)하므로, 중(中)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게 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자절진사론(&lt;刺節眞邪論&gt;)에 이르기를 &quot;양(陽)이 승(勝)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음(陰)이 승(勝)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진기(眞氣)가 거(去)하고 거(去)하면 허(虛)하니, 허(虛)하면 한(寒)이 피부(皮膚) 사이에 박(搏)하고, 허사(虛邪)가 신(身)의 심부(深)에 들어가면 한(寒)과 열(熱)이 상박(相搏)하며 오래 유(留)하여 내(內)에 착(著)하게 된다.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그 열(熱)을 승(勝)하면 골동(骨疼) 육고(肉枯)하게 되고,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그 한(寒)을 승(勝)하면 난육(爛肉) 부기(腐肌)하고 농(膿)이 되며, 내(內)로 골(骨)을 상(傷)하니, 내(內)로 골(骨)을 상(傷)하면 골식(骨蝕)이 된다. 결(結)한 것이 육(肉)에 중(中)하면 종기(宗氣)가 귀(歸)하니, 사기(邪)가 유(留)하여 불거(不去)하고,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있어 화(化)하면 농(膿)이 되고, 열(熱)이 없으면 육저(肉疽)가 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음양별론(&lt;陰陽別論&gt;)에 이르기를 &quot;삼양(三陽)이 병(病)이 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발(發)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맥요정미론(&lt;脈要精微論&gt;)에 이르기를 &quot;풍(風)은 <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태음양명론(&lt;太陰陽明論&gt;)에 이르기를 &quot;따라서 적풍(賊風) 허사(虛邪)를 범(犯)하면 양(陽)이 받고 양(陽)이 받으면 육부(六腑)에 들어가며, 육부(六腑)에 들어가면 <span style="color: #ff0000;">신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 불시와(不時臥)하고 상(上)으로 천호(喘呼)하게 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풍론(&lt;風論&gt;)에 이르기를 &quot;풍(風)이 사람을 상(傷)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거나 <span style="color: #ff0000;">열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中</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거나 <span style="color: #ff0000;">한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中</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거나 여풍(&#30296;風)하거나 편고(偏枯)하거나 풍(風)이 된다.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음식(飮食)이 쇠(衰)하고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기육(肌肉)을 소(消)한다. 따라서 사람이 질률(&#24610;慄: 마구 떨다)하면서 불능식(不能食)하니 이를 명(名)하여 <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한다. 풍기(風氣)가 양명(陽明)과 위(胃)로 들어가면 맥(脈)을 순(循)하면서 상(上)으로 목(目)의 내자(內&#30501;)에 이른다. 사람이 비(肥)하면 풍기(風氣)가 외설(外泄)하지 못하므로 <span style="color: #ff0000;">열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中</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되면서 목황(目黃)한다. 사람이 수(瘦)하면 외설(外泄)하면서 한(寒)하게 되므로 <span style="color: #ff0000;">한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中</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되면서 읍(泣)이 출(出)하게 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거통론(&lt;擧痛論&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주리(&#33120;理)가 폐(閉)하여 기(氣)가 불행(不行)하므로 기(氣)가 수(收)하게 된다. <span style="color: #ff0000;">경</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주리(&#33120;理)가 개(開)하여 영위(營衛)가 통(通)하고 한(汗)이 대설(大泄)하므로 기(氣)가 설(泄)하게 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기혈론(&lt;氣穴論&gt;)에 이르기를 &quot;영위(營衛)가 계류(稽留)되거나, 위(衛)는 산(散)하고 영(榮)은 일(溢)하여, 기(氣)는 갈(渴)하고 혈(血)은 저(著)하게 되면, 외(外)로는 <span style="color: #ff0000;">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發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내(內)로는 소기(少氣)한다. 빨리 사(瀉)하되 태(怠: 약하다)하지 않게 하여 영위(營衛)를 통(通)하여야 하니, 보이는 대로 사(瀉)하고 회(會)하는 곳은 묻지도(:問) 말라(: 사하라는 뜻).</span></p><p><span data-ke-size="size18">사기(邪)가 일(溢)하면 기(氣)가 옹(壅)하니 맥(脈)이 열(熱)하고 육(肉)이 패(敗)하여지며, 영위(營衛)가 불행(不行)하므로 반드시 농(膿)이 되고 내(內)로는 골수(骨髓)를 소(銷: 녹이다)하며, 외(外)로는 대괵(大&#33173;)을 파(破)하고, 절(節) 주(&#33120;)에 유(留)하면 반드시 패(敗)하게 된다. 적한(積寒)이 유사(留舍)하면 영위(營衛)가 거(居)하지 못하여 근육(筋肉)이 권축(卷縮)하고 늑부(肋&#32981;)가 신(伸)하지 못하며, 내(內)로는 골비(骨痺)가 되고 외(外)로는 불인(不仁)이 된다. 이를 명(命)하여 부족(不足)이라 하니 <span style="color: #ff0000;">대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大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계곡(溪谷)에 유(留)하기 때문이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맥해편(&lt;脈解篇&gt;)에 이르기를 &quot;양명(陽明)에서의 소위 오싹오싹(:&#27922;&#27922;)하게 <span style="color: #ff0000;">진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振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한다는 것은, 양명(陽明)은 오(午)이고, 음력 5월(月)은 성(盛)한 양(陽)이 음(陰)으로 가기 때문이니, 양(陽)이 성(盛)한데 음기(陰氣)가 더하여지므로 오싹오싹(:&#27922;&#27922;)하게 <span style="color: #ff0000;">진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振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는 것이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경근편(&lt;經筋篇&gt;)에 이르기를 &quot;경근(經筋)의 병(病)으로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반절(反折) 근급(筋急)하고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근(筋)이 이종(弛縱)하여 불수(不收)하며 음위(陰&#30207;)하여 불용(不用)한다. 양(陽)이 급(急)하면 반절(反折)하고 음(陰)이 급(急)하면 부(俯)하여 불신(不伸)한다. 쉬자(&#28960;刺)는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급(急)에 자(刺)한다.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근(筋)이 종(縱)하여 불수(不收)하니 번침(燔針)을 쓰지 말아야 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대혹론(&lt;大惑論&gt;)에 이르기를 &quot;사람이 잘 기(饑)하면서도 기식(嗜食)하지 못하면, 무슨 기(氣)가 그렇게 하는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백(岐伯)이 이르기를 &quot;정기(精氣)가 비(脾)에 병(幷)하고 <span style="color: #ff0000;">열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위(胃)에 유(留)하기 때문이다. 위(胃)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소곡(消穀)하므로 잘 기(饑)한다. 위기(胃氣)가 역상(逆上)하면 위완(胃脘)은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므로 기식(嗜食)하지 못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역조론(&lt;逆調論&gt;)에서 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인신(人身)은 항상 온(溫)하거나 항상 열(熱)하지도 않는데,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서 번만(煩滿)하면 이는 무엇인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백(岐伯)이 이르기를 &quot;음기(陰氣)가 소(少)하고 양기(陽氣)가 승(勝)하므로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서 번만(煩滿)하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인신(人身)의 의(衣)가 한(寒)한 것도 아니고 중(中)에 한기(寒氣)가 있는 것도 아닌데,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중(中)에서 생(生)하는 것은 왜 그러한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이는 사람에게 비기(痺氣)가 많기 때문이니 양기(陽氣)가 적고(:少) 음기(陰氣)가 많으므로(:多) 신(身)의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수(水) 중에서 출(出)하는 것과 같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사람의 사지(四肢)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다가 풍한(風寒)을 만나면 자(炙)하는 것 같고 화(火)와 같은데, 왜 그러한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이 사람은 음기(陰氣)가 허(虛)하고 양기(陽氣)가 성(盛)한 것이다. 사지(四肢)는 양(陽)이다. 두 양(陽)이 상득(相得)한 것이니 음기(陰氣)가 허소(虛少)하여지며 이로 소수(少水)가 성화(盛火)를 멸(滅)할 수 없으므로 양(陽)이 홀로 치(治)한다. 홀로 치(治)하면 생장(生長)할 수 없고 홀로 승(勝)할 뿐이다. 풍(風)을 만나면 자(炙)한 것 같고 화(火)와 같으니 이 사람은 마땅히 그 육(肉)을 삭(&#29197;)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사람의 신(身)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탕화(湯火)로도 열(熱)하게 하지 못하고 후의(厚衣)로도 온(溫)하게 하니 못한다. 그러나 동률(凍慄)하지도 않으니, 이는 무슨 병(病)인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이 사람은 평소 신기(腎氣)가 승(勝)하여 수(水)를 사(事)로 삼으니, 태양(太陽)의 기(氣)가 쇠(衰)하므로 신지(腎脂)가 고(枯)하여 장(長)하지 못하며 일수(一水)가 이화(:兩火)를 승(勝)하지를 못한다. 신(腎)은 수(水)이며 골(骨)을 생(生)한다. 골(骨)이 생(生)하지 않으면 수(髓)가 만(滿)하지 못하므로 한(寒)이 심(甚)하여 골(骨)에 이른다. 동률(凍慄)하지 않는 것은 간(肝)은 일양(一陽)이고 심(心)은 이양(二陽)이며, 신(腎)은 고장(孤藏)인데, 일수(一水)는 이화(二火)를 승(勝)하지 못하므로 동률(凍慄)하지 못한다. 이 병명(病名)은 골비(骨痺)라고 하니 이는 사람이 마땅히 연절(攣節)하게 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평열병편(&lt;評熱病篇&gt;)에 이르기를 &quot;사기(邪氣)가 주(湊)하는 곳에는 그 기(氣)가 반드시 허(虛)하다. 음(陰)이 허(虛)하면 양(陽)이 반드시 주(湊)하므로 소기(少氣) <span style="color: #ff0000;">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時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서 한출(汗出)한다. 소변(小便)이 황(黃)하면 소복(少腹) 중에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있다는 것이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병론(&lt;奇病論&gt;)에 이르기를 &quot;비(肥)는 사람을 <span style="color: #ff0000;">내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內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케 하고 감(甘)은 사람을 중만(中滿)케 한다. 따라서 그 기(氣)가 상일(上溢)하는데 전(轉)하여 소갈(消渴)이 된다. 그 치(治)는 난(蘭)으로 하니, 진기(陳氣)를 제(除)하여야 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논통편(&lt;論痛篇&gt;)에서 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사람의 병(病)은 동시(同時)에 상(傷)하여도 쉽게 낫기도 하고 혹 어렵게 낫기도 하는데, 그 연고(故)는 무엇인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소유(少兪)가 이르기를 &quot;동시(同時)에 상(傷)하였는데도, 그 신(身)에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많으면 쉽게 낫고, 한(寒)이 많으면 어렵게 낫는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오사편(&lt;五邪篇&gt;)에 이르기를 &quot;사기(邪)가 폐(肺)에 있으면 병(病)으로 피부(皮膚)가 통(痛)하고 <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며 상기(上氣)하여 천(喘)하고 한출(汗出)하며 해(咳)로 견배(肩背)를 동(動)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응중(膺中)의 외수(外&#33127;)를 취하고 배(背)의 삼절(三節) 오절(五節)의 옆(:傍)을 수(手)로 빠르게 눌러 쾌연(快然)하면 자(刺)하여야 하니, 결분(缺盆) 중에서 취하여 월(越)하게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사기(邪)가 간(肝)에 있으면 냥(兩) 협중(脇中)이 통(痛)하고 <span style="color: #ff0000;">한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中</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며 악혈(惡血)이 내(內)에 있어 행(行)하면서 잘 체절(&#25507;節)하고 시(時)로 각종(脚腫)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행간(行間)에서 취하여 협하(脇下)로 인(引)하고, 삼리(三里)를 보(補)하여 위중(胃中)을 온(溫)하게 하며, 혈맥(血脈)을 취하여 악혈(惡血)을 산(散)하고, 이간(耳間)의 청맥(靑脈)을 취하여 그 체(&#25507;)를 거(去)하게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사기(邪)가 비위(脾胃)에 있으면 병(病)으로 기육(肌肉)이 통(痛)한다. 양기(陽氣)가 유여(有餘)하고 음기(陰氣)가 부족(不足)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열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中</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으로 잘 기(飢)하고, 양기(陽氣)가 부족(不足)하고 음기(陰氣)가 유여(有餘)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中</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으로 장명(腸鳴) 복통(腹痛)한다. 음양(陰陽)이 모두 유여(有餘)하거나 모두 부족(不足)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있거나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모두 삼리(三里)에서 조(調)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오륭진액별편(&lt;五&#30275;津液別篇&gt;)에 이르기를 &quot;천(天)이 서(暑)한데 의(衣)가 후(厚)하면 주리(&#33120;理)가 개(開)하므로 한(汗)이 출(出)한다. 한(寒)이 분육(分肉) 사이에 유(留)하여 말(沫)이 취(聚)하면 통(痛)하게 된다. 천(天)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주리(&#33120;理)가 폐(閉)하여 기습(氣濕)이 불행(不行)하는데, 수(水)가 방광(膀胱)에 하류(下留)하면 뇨(溺)와 기(氣)가 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통평허실론(&lt;通評虛實論&gt;)에서 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유자(乳子)가 <span style="color: #ff0000;">병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病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서 맥(脈)이 현소(懸小)하면 어떠한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백(岐伯)이 이르기를 &quot;수족(手足)이 온(溫)하면 생(生)하고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사(死)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유자(乳子)가 <span style="color: #ff0000;">풍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風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에 중(中)하여 천명(喘鳴) 견식(肩息)하면 맥(脈)은 어떠한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천명(喘鳴) 견식(肩息)하면 맥(脈)이 실대(實大)한데, 완(緩)하면 생(生)하고 급(急)하면 사(死)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맥요정미론(&lt;脈要精微論&gt;)에 이르기를 &quot;조대(粗大)하면 음(陰)이 부족(不足)하고 양(陽)이 유여(有餘)하니 <span style="color: #ff0000;">열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中</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된다. 침세(沈細) 삭산(數散)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된다. 부(浮)에 조(躁)하지 않으면 모두 양(陽)에 있는 것이니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되고 조(躁)가 있으면 수(手)에 있는 것이다. 세(細)하면서 침(沈)하면 모두 음(陰)에 있는 것으로 골통(骨痛)이 되며 정(靜)하면 족(足)에 있는 것이다. 양기(陽氣)가 유여(有餘)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신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熱</span><span style="color: #ff0000;">) </span>무한(無汗)하고, 음기(陰氣)가 유여(有餘)하면 다한(多汗) <span style="color: #ff0000;">신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身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며, 음양(陰陽)이 유여(有餘)하면 무한(無汗)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다. 추(推)하여 외(外)하여도 내(內)하고 불외(不外: 외에 있지 않다)하면 심복(心腹)에 적(積)이 있는 것이고, 추(推)하여 내(內)하여도 외(外)하고 불내(不內: 내에 있지 않다)하면 신(身)에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있는 것이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논질진척편(&lt;論疾診尺篇&gt;)에 이르기를 &quot;척(尺)의 부(膚)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심(甚)하고 맥(脈)이 성조(盛躁)하면 온병(瘟病)이니, 그 맥(脈)이 성(盛)하면서 활(滑)하면 병(病)이 또 출(出)한다. 척(尺)의 부(膚)가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그 맥(脈)이 소(小)하면 설(泄)하고 소기(少氣)한다. 척(尺)의 부(膚)가 사르듯이(:炬然) 먼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후에 한(寒)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다. 척(尺)의 부(膚)가 먼저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오래 잡아도(:久持 &lt;-久大) 열(熱)하면 또한 <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다. 주(&#32920;)가 홀로 열(熱)하면 요(腰) 이상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수(手)가 홀로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요(腰) 이하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며, 주(&#32920;) 앞이 홀로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응(膺)의 앞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주(&#32920;)의 후가 홀로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견배(肩背)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며, 비중(臂中)이 홀로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요복(腰腹)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다. 주(&#32920;)의 후렴(後廉 &lt;-後粗) 이하 3~4촌(寸)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장중(腸中)에 충(蟲)이 있다. 장중(掌中)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복중(腹中)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장중(掌中)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복중(腹中)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다. 어제 위(:魚上)의 백육(白肉)에 청(靑)한 혈맥(血脈)이 있으면 위중(胃中)에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있는 것이다. 척(尺)이 사르듯(:炬然)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인영(人迎)이 대(大)하면 당연히 탈혈(奪血)이니, 척(尺)이 견대(堅大)하고 맥(脈)의 소(小)가 심(甚)하며 소기(少氣)하고 더하여 만(&#24727;: 흐리다)하면 바로 죽는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진(診)할 때 적맥(赤脈)이 상하(上下)에서 동자(瞳子)에 이를 경우, 일맥(一脈)에 나타나면 일년(:一歲)에 죽고 일맥(一脈) 반(半)에 나타나면 일년 반(:一歲半)에 죽으며, 이맥(二脈)에 나타나면 이년(:二歲)에 죽고 이맥반(二脈半)에 나타나면 이년 반(:二歲半)에 죽으며, 삼맥(三脈)에 나타나면 삼년(:三歲)에 죽는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사기장부병형편(&lt;邪氣藏府病形篇&gt;)에 이르기를 &quot;우수(憂愁) 공구(恐懼)는 심(心)을 상(傷)한다. <span style="color: #ff0000;">형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形寒</span><span style="color: #ff0000;">) </span><span style="color: #ff0000;">한음</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飮</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폐(肺)를 상(傷)한다. <span style="color: #ff0000;">양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兩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에 상감(相感)하여 중외(中外)가 모두 상(傷)하면 기(氣)가 역(逆)하면서 상행(上行)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병(病)의 육변(六變)은 어떠한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백(岐伯)이 이르기를 &quot;급(急)은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많고, 완(緩)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많다. 대(大)는 다기(多氣) 소혈(少血)하고, 소(小)는 혈기(血氣)가 모두 소(少)하다. 활(滑)은 양기(陽氣)가 성(盛)하면서 미(微)하게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있고, 삽(澁)은 다혈(多血) 소기(少氣)하여 미(微)하게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있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평인기상론(&lt;平人氣象論&gt;)에 이르기를 &quot;촌구맥(寸口脈)이 침(沈)하면서 약(弱)하거나 침(沈)하면서 천(喘)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말한다. 완(緩)하면서 활(滑)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열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中</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말한다. 척(尺)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맥(脈)이 세(細)하면 후설(後泄)이라 말한다. 척(尺)이 조(粗)하고 항상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열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中</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말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경락론(&lt;經絡論&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많으면 응삽(凝泣)하고 응삽(凝泣)하면 청흑(靑黑)하다.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많으면 요택(&#28118;澤: 매끄럽다)하고 요택(&#28118;澤)하면 황적(黃赤)하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피부론(&lt;皮部論&gt;)에 이르기를 &quot;그 색(色)에 청(靑)이 많으면 통(痛)하고 흑(黑)이 많으면 비(痺)하며 황적(黃赤)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백(白)이 많으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며 오색(五色)이 모두 나타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사기(邪)가 근골(筋骨) 사이에 유(留)할 때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많으면 근련(筋攣) 골통(骨痛)하고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많으면 근이(筋弛) 골소(骨消) 육삭(肉&#29197;) 균파(&#17411;破) 모직(毛直)하면서 패(敗)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오색편(&lt;五色篇&gt;)에 이르기를 &quot;오색(五色)은 무엇인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청흑(靑黑)은 통(痛)하고 황적(黃赤)은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며 백(白)은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니, 이것을 오관(五官)이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인영(人迎)이 성견(盛堅)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에 상(傷)한 것이고, 기구(氣口)가 성견(盛堅)하면 식(食)에 상(傷)한 것이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경맥편(&lt;經脈篇&gt;)에 이르기를 &quot;락맥(絡脈)을 진(診)할 때, 맥색(脈色)이 청(靑)하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통(痛)하며 적(赤)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있다. 위중(胃中)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수어(手魚)의 락(絡)이 대부분 청(靑)하다. 위중(胃中)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어제(魚際)의 락(絡)이 적(赤)한데, 갑자기 흑(黑)하면 유(留)가 오래된 비(痺)이다. 적(赤)이 있고 흑(黑)이 있고 청(靑)이 있으면 <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기(氣)이다. 청단(靑短)하면 소기(少氣)이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육원정기대론(&lt;六元正紀大論&gt;)에서 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그대가 &#39;<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쓰되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원(遠)하게 하고,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쓰되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원(遠)하게 하라&#39;고 말하였는데, 원(願)하건대 그 원(遠)은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싶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백(岐伯)이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열(熱)을 범(犯)하지 말고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한(寒)을 범(犯)하지 말라는 것이다. 종(從)하면 화(和)하게 하고 역(逆)하면 병(病)하니, 경외(敬畏)하여 원(遠)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39;시(時)는 육위(六位)에 흥(興)한다.&#39;는 것이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내가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원(遠)하게 하지 않고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원(遠)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발표(發表)에는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원(遠)하게 하지 않고 공리(攻裏)에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원(遠)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발(發)하지 않고 공(攻)하지 않으면서 한(寒)을 범(犯)하거나 열(熱)을 범(犯)하면 어떻게 되는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내(內)를 적(賊: 해치다)하므로 그 병(病)이 더 심(甚)하게 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원(願)하건대 무병(無病)하면 어떠한지 듣고 싶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무(無)하면 생(生)하고 유(有)하면 심(甚)하여진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생(生)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열(熱)을 원(遠)하게 하지 않으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이르고 한(寒)을 원(遠)하게 하지 않으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이른다.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이르면 견부(堅否) 복만(腹滿) 통급(痛急) 불리(不利)의 병(病)이 생(生)한다.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이르면 신열(身熱) 토하(吐下) 곽란(&#38669;亂) 옹저(癰疽) 창양(瘡瘍) 무울(&#30592;鬱) 주하(注下) 순계(&#30628;&#30216;) 종창(腫脹) 구(嘔) 구뉵(&#40765;&#34884;) 두통(頭痛) 골절변(骨節變) 육통(肉痛) 혈일(血溢) 혈설(血泄) 임민(淋悶)의 병(病)이 작(作)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이의 치(治)는 어떻게 하는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시(時)에 반드시 순(順)하여야 하니, 이를 범(犯)하면 승(勝)으로 치(治)하여야 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사전편(&lt;師傳篇&gt;)에서 기백(岐伯)이 이르기를 &quot;치민(治民)와 자치(自治), 치피(治彼)와 치차(治此), 치소(治小)와 치대(治大), 치국(治國)과 치가(治家)는 역(逆)으로 치(治)할 수 없으니 오직 순(順)할 뿐이다. 백성(百姓) 인민(人民)이 모두 그 지(志)를 순(順)하려는 것이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순(順)한다는 것이 무엇인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국(國)에 들어가면 그 속(俗)을 문(問)하고 가(家)에 들어가면 그 휘(諱)를 문(問)하며 당(堂)에 올라가면 그 예(禮)를 문(問)하고 병인(病人)에 임(臨)하면 그 편(便)한 바를 문(問)하여야 하는 것이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병인(病人)에서 그 편(便)한 바는 무엇인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중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中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 소단(消&#30281;)이면 한(寒)이 편(便)하고 <span style="color: #ff0000;">한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中</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속(屬)이면 열(熱)이 편(便)하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위중(胃中)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소곡(消穀)하고 현심선기(縣心善飢)하며 제(臍) 이상의 피(皮)가 열(熱)하다. 장중(腸中)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미(&#31964;)와 같은 황(黃)이 출(出)하고 제(臍) 이하의 피(皮)가 한(寒)하다. 위중(胃中)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복창(腹脹)한다. 장중(腸中)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장명(腸鳴) 손설(&#39153;泄)한다. 위중(胃中)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장중(腸中)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창(脹)하면서 또 설(泄)한다. 위중(胃中)이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고 장중(腸中)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질기(疾飢) 소복통창(小腹痛脹)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지진요대론(&lt;至眞要大論&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열(熱)하게 하고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한(寒)하게 하며, 미(微)하면 역(逆)하게 하고 심(甚)하면 종(從)하게 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무엇을 역종(逆從)이라 말하는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백(岐伯)이 이르기를 &quot;역(逆)은 정치(正治)이고, 종(從)은 반치(反治)이다. 종(從)이 소(少)하게 할 것인가 종(從)을 다(多)하게 할 것인가는 그 사(事)를 살펴야 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병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病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에 한(寒)하여도 열(熱)하고, <span style="color: #ff0000;">병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病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에 열(熱)하여도 한(寒)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있다. 새로운 병(:新病)이 다시 기(起)하면 어떻게 치(治)하여야 하는가?&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여도 열(熱)하는 것은 음(陰)에서 취하여야 하고, <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게 하여도 한(寒)한 것은 양(陽)에서 취하여야 한다. 소위 &#39;그 속(屬)을 구(求)한다.&#39; 는 것이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팔정신명론(&lt;八正神明論&gt;)에 이르기를 &quot;천(天)이 온(溫)하고 일(日)이 명(明)하면 사람의 혈(血)이 요일(&#28118;溢: 넘치게 젖다)하고 위기(衛氣)가 부(浮)하므로 혈(血)이 쉽게 사(瀉)하고 기(氣)가 쉽게 행(行)한다. 천(天)이 한(寒)하고 일(日)이 음(陰)하면 사람의 혈(血)이 응삽(凝泣)하고 위기(衛氣)가 침(沈)한다. 따라서 천(天)이 <span style="color: #ff0000;">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자(刺)하지 말고, 천(天)이 <span style="color: #ff0000;">온</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溫</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면 (자(刺)하기를) 의심(疑)하지 말라. 월(月)이 생(生)하면 사(瀉)하지 말고 월(月)이 만(滿)하면 보(補)하지 말며, 월곽(月郭)이 공(空)하면 치(治)하지 말라. 이는 &#39;시(時)를 얻어 조(調)하여야 한다.&#39;는 것을 말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골공론(&lt;骨空論&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을 구(灸)하는 법(法)은 먼저 항(項)의 대추(大椎)를 구(灸)하되, 그 나이(:年)를 장수(壯數)로 삼고 그 다음에 궐골(&#27227;骨: 미저골 곧 장강혈)을 구(灸)하되 그 나이를 장수(壯數)로 삼는다. 배수(背兪)를 보고 함(陷)한 곳에 구(灸)한다. 비(臂)를 들어 견상(肩上)의 함(陷)한 곳을 구(灸)한다. 양 계협(季脇)의 사이(: 경문혈)에 구(灸)한다. 외과(外&#36381;) 상(上) 절골(絶骨)의 단(端: 곧 양보혈)을 구(灸)한다. 족(足)의 소지(小指)의 차지(次指)의 사이(:곧 협계혈)를 구(灸)한다. 천하(&#33128;下)의 함(陷)한 맥(脈: 곧 승산혈)을 구(灸)한다. 외과(外&#36381;) 후를 구(灸)한다. 결분(缺盆)의 골상(骨上)이 절(切)하면 근(筋)과 같이 견통(堅痛)한 곳을 구(灸)한다. 응중(膺中)의 함(陷)한 골(骨) 사이(:곧 천돌혈)을 구(灸)한다. 장(掌)의 속골(束骨)의 하(下)를 구(灸)한다. 제하(臍下) 관원(關元) 3촌(寸)을 구(灸)한다. 모제(毛際)의 동맥(動脈: 곧 기충혈)을 구(灸)한다. 슬하(膝下) 3촌(寸) 분(分)의 사이를 구(灸)한다. 족양명(足陽明) 부상(&#36311;上)의 동맥(動脈: 곧 충양혈)을 구(灸)한다. 전상(&#24019;上: 곧 백회혈)을 한 번 구(灸)한다. 견(犬)에 물린 곳은 3장(壯) 구(灸)하되 견상병(犬傷病)의 법(法)대로 구(灸)한다. 모두 29처(處)에 마땅히 구(灸)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상식(傷食)에도 구(灸)한다. 낫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경(經)의 양(陽)이 지나가는(:過) 것을 보고서 그 수(兪)를 자주 자(刺)하여야 하고, 또 약(藥)을 써야 한다.&quot; 하니라.</span></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