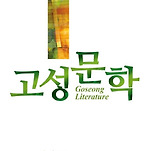<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b><span data-ke-size="size20">&#160; 자연약국 김 약사</span></b>&#160;(외 1편)</span><br><br><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 &#160; 정병근</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160; &#160;그는 아저씨가 아니고 선생님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꼬마들이 무심코 아저씨라고 부르기라도 하면 그는 일단 미간부터 찡그린다</span><span data-ke-size="size18">. &quot;</span><span data-ke-size="size18">아저씨가 뭐야</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약사 선생님이라고 해야지</span><span data-ke-size="size18">.&quot;&#160;</span><span data-ke-size="size18">눈치 빠른 엄마의 핀잔을 확인하고서야&#160;</span><span data-ke-size="size18">&quot;</span><span data-ke-size="size18">어이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우리 꼬마 환자님</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감기 걸리셨군요</span><span data-ke-size="size18">.&quot;</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며 활짝 웃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이를테면 옆집 슈퍼 아저씨나 세탁소 아저씨 할 때의 그 아저씨들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우월감 같은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8203;&#160; &#160;&#160;</span><span data-ke-size="size18">문제는 남자들인데 이들은 대개 처방전도 없이 불쑥 들어와서는</span><span data-ke-size="size18">, &quot;</span><span data-ke-size="size18">아저씨 술 깨는 약 좀 주세요</span><span data-ke-size="size18">.&quot;&#160;</span><span data-ke-size="size18">한다든지</span><span data-ke-size="size18">, &quot;</span><span data-ke-size="size18">뭐 좀 확 풀리는 거 없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quot; &quot;</span><span data-ke-size="size18">우루소 두 알하고 휘청수나 하나 줘 봐요</span><span data-ke-size="size18">.&quot;&#160;</span><span data-ke-size="size18">약사 선생님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그래도 남자들은 시원시원해서 좋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기껏해야 만 원 미만인 약값을 따지고 드는 쩨쩨한 남자는 없으니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드링크제를 마시고 트림까지 하는 남자라면 정상가격보다 천 원 정도 더 받아도 상관없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기분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160; &#160;&#8203;&#160;</span><span data-ke-size="size18">남자들이 회사에 나가고 없는 낮에는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위층 가정의학과에서 받은 처방전을 들고 와서는&#160;</span><span data-ke-size="size18">&quot;</span><span data-ke-size="size18">아이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내가 아파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quot;&#160;</span><span data-ke-size="size18">한참씩 수다를 떨다 가곤 하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그는 이때야말로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한껏 과시하면서 건강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척하다가</span><span data-ke-size="size18">, &quot;</span><span data-ke-size="size18">아이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나하고 똑같네</span><span data-ke-size="size18">!&quot;&#160;</span><span data-ke-size="size18">상대방이 맞장구를 세 번 정도 칠 때쯤이면 슬그머니&#160;</span><span data-ke-size="size18">&quot;</span><span data-ke-size="size18">이걸 한번 복용해 보시죠</span><span data-ke-size="size18">.&quot;</span><span data-ke-size="size18">라며 권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대개 외국 이름의 알약이나 건강 보조 약품들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quot;</span><span data-ke-size="size18">어서 오세요</span><span data-ke-size="size18">&quot;&#160;</span><span data-ke-size="size18">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던 그가 일어나며 오늘의 열두 번째인가 열세 번째 고객을 맞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며칠 전에 호주산 로열제리 농축 캡슐 한 세트를 사 갔던 단골 아주머니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br><br><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b>&#160;구두 아저씨</b></span><br><br><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160; &#160;〈</span><span data-ke-size="size18">대한구두미화중앙협의회 한강&#160;</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지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코딱지만 한 공간에 쪼그리고 앉아&#160;</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두 번 다시는 못할 짓</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하고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구두약은 맨손으로 탁탁 먹여야 훨씬 약발이 좋지</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하루 백 켤레만 잡아도 일 년이면 삼천육백 켤레</span><span data-ke-size="size18">, 30</span><span data-ke-size="size18">년 동안 백만 켤레 정도 될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대통령 출마하면 백만 표는 굳었다며 실실 웃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문득</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그를 거쳐 간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해진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여기 있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 많이 만나</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그의 씩씩한 팔뚝에 마음이 동해서 다짜고짜 여관 가자고 조르던 여자 이야기를 슬슬 꺼내면서 구두 속에 손을 넣고 침을 퉤퉤 뱉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불 광</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물 광 해도 침 광이 최고지</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지문은 닳아서 없어진 지 오래야</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구두약을 문지르느라 반들반들한 손을 들어 보인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일이 끝나면 좍 빼 입고 이태원을 쓸고 다녔다는&#160;</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물 반</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고기 반</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시절의 무용담을 들으며 백만 명의 구두를 닦느라 결 없이 맨들맨들해진 그의 손이 성수</span><span data-ke-size="size18">聖手</span><span data-ke-size="size18">처럼 거룩해 보여서 나도 실실 웃음이 나는 것이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br><br><br><br><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160; &#160; &#160; &#160; &#160; &#160;―</span><span data-ke-size="size18">시집&#160;</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우리 동네 아저씨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160;(2024)</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정병근 / 1962년 경북 경주 출생. 동국대 국문과 졸업. 1988년 계간 《불교문학》으로 등단. 시집 『오래 전에 죽은 적이 있다』 『번개를 치다』 『태양의 족보』 『눈과 도끼』 『중얼거리는 사람』 『우리 동네 아저씨들』.</span></td></tr></tbody></table></div>
<!-- -->
카페 게시글
추천 詩 감상
자연약국 김 약사 (외 1편) / 정병근
박봉준
추천 0
조회 26
24.06.29 08:1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