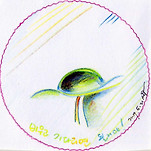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p><p style="text-align: center;"></p><p style="text-align: center;"></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br></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007505FD21E711C"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049.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순교자 현양탑</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 일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는 </p><p style="text-align: center;">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그리고 1866년부터 1873년까지의 병인박해기를 거치며 </p><p style="text-align: center;">수많은 천주교인이 처형을 당했다. 이곳에서 순교한 수많은 사람 중 성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p><p style="text-align: center;">&nbsp;44명은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이 되던 1984년 5월 6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p><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천주교회에서는 성인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 1984년 현재의 공원 안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p><p style="text-align: center;">순교자 현양탑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1997년 공원이 새로 단장되면서 기존의 현양탑이 헐리게 되었다. </p><p style="text-align: center;">이에 한국천주교회는 1999년 이곳에 새로운 순교자 현양탑을 세웠다. 현재 44명의 성인과 </p><p style="text-align: center;">복자 27명을 비롯해 진리를 입증하다가 희생된 수많은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strong></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00F505FD21E721C"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048.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뚜께 우물(망나니 우물)</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조선시대 국가 공식 처형장소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뚜께우물 터이다. </p><p style="text-align: center;">&nbsp;우물이 크고 깊으며 물의 양이 많아 늘 흘러내려 평상시에는 우물의 덮개를 덮어 두고 있다가 </p><p style="text-align: center;">망나니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뚜껑을 열고 칼을 씻었다고 전해진다. </p><p style="text-align: cente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사형 집행 당시, 망나니가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칼날에 뿜어 대며 죄인 주위를 돌면 </p><p style="text-align: center;">가족이나 친지들이 돈을 던져 주며 ‘행하(行下)’라는 팁을 주었다고 한다. </p><p style="text-align: center;">가급적 고통을 주지 말고 단칼로 죽여 달라는 부탁이었다. 뚜께우물이라는 이름은 </p><p style="text-align: center;">일제강점기에 개정蓋井우물이라는 명칭이 되었고, 주변 마을의 이름도 “개정동”이라 불리었다.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01F505FD21E721C"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067.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Homeless Jesus</strong> (노숙자 예수)</p><p style="text-align: center;"><br></p><p class="txttit pc" style="text-align: center;">노숙자 예수 Homeless Jesus, 티모시 슈말츠, 2013</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얇은 담요를 얼굴까지 덮어쓰고 잠을 청하는 노숙인의 모습이다.</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nbsp;담요 밖으로 삐져나온 그의 발등에 못이 박혔던 흔적이 보인다. </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캐나다 작가 티모시 슈말츠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에서</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nbsp;영감을 받아 노숙인의 모습으로 예수를 표현했다. </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성경 속의 예수님이든, 생존경쟁에서 낙오되어 노숙인이 된 사람이든 </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에 대한 </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상념을 일깨우고 있다. 노숙자의 모습을 한 예수상이 처음 어느 성당 앞에 설치되었을 때, </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신성 모독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아 철거되었다. </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nbsp;&nbsp;&nbsp;&nbsp;&nbsp;&nbsp; 하지만 곧 로마 교황청에서 바티칸 인근에서 얼어 죽은 노숙인을 기리기 위해 </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이 작품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축복함으로써 </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로마 교황청에 이어 스페인의 마드리드, 아일랜드의 더블린, </p><p class="txtdeep" style="text-align: center;">싱가포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등 세계 각지에 설치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F91505FD21E731C"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070.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서소문 밖 연대기</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조완희, 조준재 作</p><p style="text-align: center;">화강석, 대리석, 청동,&nbsp;600x140x800cm</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조선말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병인박해를 거치며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p><p style="text-align: center;">작은 십자가들로 이루어진 칼로서 역사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FF2505FD21E741C"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077.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조완희, 조준재 作</p><p style="text-align: center;">화강석, 대리석, 청동,&nbsp;600x140x800cm</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아래: 누워진 사람들의 군상을 사람 人자와 서소문의 ㅅ자의 중첩의미로 표현하고, 주야간 시간대별 변하는 음영의 </p><p style="text-align: center;">흐름으로 자연의 질서에 따른 과거 서소문 밖의 모든 사람과 현재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표현하였다.</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034505FD21E741C" class="txc-image" actualwidth="704" width="70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01.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p><p style="text-align: center;">조광호 作</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기쁨과 부활의 창 </strong><strong>(</strong><strong>부활신앙의 증거</strong><strong>)</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br></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독일산 백유리 8T 위에 , 안틱글라스 라미네이팅, 독일 산 투명유약 600도 소성,&nbsp;146 x 429cm&nbsp;제대우측 상부창</p><p style="text-align: center;">이 공간은 종교적이고 명상적인 공간으로 진입하는 공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p><p style="text-align: center;">빛과 색채로 표현하였다.&nbsp;하느님과의 일치를 갈망하던 순교자들의 영적인 열정을 빛으로 묘사하여 자가를 통해 </p><p style="text-align: center;">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예시하고자 하였다.&nbsp;&nbsp;&nbsp;&nbsp;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13F505FD21E741C"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02.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진입 광장 '빛의 광장' (이경순 작)</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입구 오른편에 <strong>수난자의 머리</strong><strong><br></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최의순 作</p><p style="text-align: center;">시멘트,&nbsp;40x40x43(h)cm</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수난자는 식민의 유산을 떠안은 채 다가온 한국전쟁과 분단의 고통이 채 가시지 않은 시대를 살아온 </p><p style="text-align: center;">우리 민족의 자화상이다. 절제된 형태와 재료의 물성에서 나오는 거친 숨소리에는 길고 긴 어둠의 </p><p style="text-align: center;">세월을 견뎌낸 우리의 처연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057505FD21E751C"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04.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순교자의 칼</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이경순 作</p><p style="text-align: center;">청동브론즈, 스테인리스 스틸,&nbsp;140x75 x 410(h)-좌,140 x 75 x 510(h)-우</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조선시대 죄인들의 목에 씌웠던 칼을 형상화하여 중첩 배열함으로써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p><p style="text-align: center;">의로운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통 속에서 땅을 뚫고 나와 하늘로 치솟는 </p><p style="text-align: center;">작품의 형태는 의로운 이들의 기개를 상징하기도 한다.<strong></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E25425FD21E7538" class="txc-image" actualwidth="704" width="70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05.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103위 순교성인</strong>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박아련 作</p><p style="text-align: center;">파라핀, 100x80x250cm</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529425FD21E7601"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07.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어느 난민복서를 향한 시선</strong>&nbsp;<strong>&nbsp;(이환권 작품)</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FRP 파스텔에 흑연채색,&nbsp;260.5x318.5x88.2cm</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아프리카 분쟁지역의 하나인 카메룬 출신인 이 작품의 주인공은 2013년 난민법 마련 이후 2018년까지 </p><p style="text-align: center;">한국 난민 지위를 얻은 855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2015년 문경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를 </p><p style="text-align: center;">기회로 동료 선수와 함께 숙소를 이탈한 후 난민지위를 얻었다. 복싱은 그의 생존방식이지만 피부색이 </p><p style="text-align: center;">다른 이방인 파이터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난민들에 대한 박해는 </p><p style="text-align: center;">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538425FD21E7601"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08.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오상일 작품 / 구원의 노래 작품 전시</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887425FD21E7737"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09.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612425FD21E7731"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13.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DD5425FD21E7736"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76.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578425FD21E7801"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15.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성 정하상 기념 경당 </strong><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0574D5FD21E7808"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16.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제대</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8CA4D5FD21E781B"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18.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정하상 기념 경당 내부</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6EF4D5FD21E791B"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20.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피에타 상</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429465FD21FDB04" class="txc-image" actualwidth="776" width="776"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20201124_154125.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DA24D5FD21E791A"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21.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세 개의 못 (조준재 작)</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87B4D5FD21E791D"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35.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5F84D5FD21E7A31"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36.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FBD4D5FD21E7A1E"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37.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4AC465FD21E7A3A"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38.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8BB465FD21E7B39"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39.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하늘광장 (정현 작 / 서 있는 사람들)</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4C0465FD21E7B37"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46.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하늘길</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4F5465FD21E7B02"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48.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BC1465FD21E7C01"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70.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상설전시실</strong><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53E465FD21E7D37"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74.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C23465FD21E7D35"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28.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CC4445FD21E7D30"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32.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콘솔레이션 홀에서 본 영상물<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D1B445FD21E7E33"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77.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5C6445FD21E7E31"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40.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예사롭지 않게 펼쳐짐.<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2A1445FD21E7E01"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180.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083445FD21E7F34" class="txc-image" actualwidth="704" width="70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218.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F44445FD21E7F31"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219.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오후 3시 미사를 참례하고 나오니 흐린 날씨였는데 하늘에 구름이 멋지게 펼쳐져 있다.</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2D7445FD21E7F34" class="txc-image" actualwidth="650" width="65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IMG_0222.jpg" exif="{}"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11월 24일 (화)</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0, 237, 125);">* 코로나 19로 인하여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nbsp;비상조치에 따라</span><span style="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0, 237, 125);">&nbsp;</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0, 237, 125);">12월 5일 (토) ~ 12월 18일 (금) 임시 휴관입니다.</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0, 237, 125);"><br></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작품 해설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홈피에서 가져옴.)</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코로나로 인하여 성지 순례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span><br></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