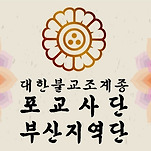<div class="tmp_agenda newline"><h3><span style="color: rgb(0, 0, 0);">목차</span></h3><ol><li><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7354&amp;cid=42661&amp;categoryId=42661&amp;expCategoryId=42661#TABLE_OF_CONTENT1"><u><font color="#0066cc"><span style="color: rgb(0, 0, 0);">춤추고 노래하는 인도신화의 괴물</span></font></u></a></li><li><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7354&amp;cid=42661&amp;categoryId=42661&amp;expCategoryId=42661#TABLE_OF_CONTENT2"><u><font color="#0066cc"><span style="color: rgb(0, 0, 0);">매력적인 선녀로 변신한 중국과 한국의 비천상</span></font></u></a></li><li><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7354&amp;cid=42661&amp;categoryId=42661&amp;expCategoryId=42661#TABLE_OF_CONTENT3"><u><font color="#0066cc"><span style="color: rgb(0, 0, 0);">비천상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span></font></u></a></li></ol></div><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비천상은 주로 사찰의 범종에서 볼 수 있으나 때로는 석등, </span><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7377&amp;ref=y"><u><font color="#0066cc"><span style="color: rgb(0, 0, 0);">부도</span></font></u></a><span style="color: rgb(0, 0, 0);">, </span><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7365&amp;ref=y"><u><font color="#0066cc"><span style="color: rgb(0, 0, 0);">불단</span></font></u></a><span style="color: rgb(0, 0, 0);">이나 </span><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7366&amp;ref=y"><u><font color="#0066cc"><span style="color: rgb(0, 0, 0);">단청</span></font></u></a><span style="color: rgb(0, 0, 0);">의 별지화(</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別</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枝</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畵</span><span style="color: rgb(0, 0, 0);">) 등에도 나타난다. 비천은 불교의 천국에서 허공을 날며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면서 꽃을 뿌려 부처님을 공양·찬탄하는 천인(</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天</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人</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일종이다. 천의(</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天</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衣</span><span style="color: rgb(0, 0, 0);">) 자락을 휘날리며 허공에 떠 있는 비천상은 마치 도교설화 속에 등장하는 선녀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원래 비천의 조상(</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祖</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上</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은 오늘날 우리가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거나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다.</span><div class="autosourcing-stub"><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color: black;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춤추고 노래하는 인도신화의 괴물</strong></span></p><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비천은 고대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건달바(</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乾</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38373;</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婆</span><span style="color: rgb(0, 0, 0);">)와 긴나라(</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緊</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那</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羅</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원형으로 삼고 있다. 건달바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오직 향(</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香</span><span style="color: rgb(0, 0, 0);">)만을 구하여 몸을 보호한다. 또 스스로 몸에서 향기를 발산하므로 향음신(</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香</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音</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神</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이라고도 하며 속악(</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俗</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樂</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을 연주한다. 이 건달바가 불교 성립과 함께 팔부중의 하나로 포섭되어 하늘의 가신(</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歌</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神</span><span style="color: rgb(0, 0, 0);">)으로 자리잡게 되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묘법연화경』 「서품」을 보면, 부처가 고대 중인도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사성(</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王</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舍</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城</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영산도량에서 설법할 때 사부대중과 더불어 네 건달바왕이 참석하였는데, 악(</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樂</span><span style="color: rgb(0, 0, 0);">)건달바·악음(</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樂</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音</span><span style="color: rgb(0, 0, 0);">)건달바·미(</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美</span><span style="color: rgb(0, 0, 0);">)건달바·미음(</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美</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音</span><span style="color: rgb(0, 0, 0);">)건달바가 그들이라 했다. 긴나라 역시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천신이며 팔부중의 하나로 불교에 포섭되어 천악신(</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天</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樂</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神</span><span style="color: rgb(0, 0, 0);">) 또는 가악신(</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歌</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樂</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神</span><span style="color: rgb(0, 0, 0);">)으로 불렸다. 건달바가 속악을 연주하는 것에 비하여 긴나라는 법악(</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法</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樂</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을 연주한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이들의 형상은 원래 사람인지 짐승인지 새인지 일정하지 않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괴물의 모습이라 한다. 사람 머리에 새의 몸을 하거나, 말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는 등 그 형상도 일정하지 않다. 『한국불교사전』에 수록된 긴나라의 도판을 보면 작달막하고 뚱뚱한 몸에 날개를 단 난쟁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날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비천상의 모습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span><div class="autosourcing-stub"><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color: black;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span style="color: rgb(0, 0, 0);"><strong>매력적인 선녀로 변신한 중국과 한국의 비천상</strong></span></p><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2,000여 년 전 불교가 인도로부터 동점(</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東</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漸</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길을 따라 중국에 전래될 때 비천도 그 뒤를 따랐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둔황석굴의 벽화를 보면 비천과 중국 고유의 신선들이 한 화면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둔황석굴 제305굴 벽화에는 불교의 제석천(</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帝</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釋</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天</span><span style="color: rgb(0, 0, 0);">)</span><a class="word_sup"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7354&amp;cid=42661&amp;categoryId=42661&amp;expCategoryId=42661#footNote1"><sup id="footNoteSrc1"><u><font color="#0066cc" size="2"><span style="color: rgb(0, 0, 0);">1)</span></font></u></sup></a><span style="color: rgb(0, 0, 0);">에 비견되는 동왕공(</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東</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王</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公</span><span style="color: rgb(0, 0, 0);">)과 그의 비(</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妃</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인 서왕모(</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西</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王</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母</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호위하며 하늘을 나는 수많은 비천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외래의 불교사상과 중국 고유의 신선사상이 병존하고 있는 현상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그런데 둔황석굴 벽화에 그려진 비천은 이미 인도신화의 건달바나 긴나라의 괴이한 형상에서 벗어나 도교설화의 선녀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해 있다. 상반신은 나신이고 하반신은 비단처럼 부드러운 속옷 차림이어서 신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난다. 표정은 요염하며 손의 동작은 유연하고 섬세하다. 이와 같은 모습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이미 페르시아 등 서역의 귀족적인 풍모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span></p><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br></p><div class="thmb c"><a href="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97354&amp;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751976_NIGG9J2PI.jpg%2Fed125_8_i3.jpg%3Ftype%3Dm4500_4500_fst_n%26wm%3DY" target="_blank"><img width="406" height="302" alt="중국 둔황석굴 벽화의 비천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751976_NIGG9J2PI.jpg%2Fed125_8_i3.jpg%3Ftype%3Dw406_fst_n%26wm%3DY" data-seq="1" data-title="중국 둔황석굴 벽화의 비천상" origin_src="http://dbscthumb.phinf.naver.net/2743_000_1/20130925180751976_NIGG9J2PI.jpg/ed125_8_i3.jpg?type=m4500_4500_fst_n&amp;wm=Y" origin_width="1004" origin_height="749" source="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hastitle="N" desc="가운데의 동왕공을 수많은 비천들이 호위하며 하늘을 날고 있다. 중국 고유의 신선사상과 외래의 불교사상이 병존하고 있는 그림이다."></a><p class="thmb_desc" style="width: 401px;"><p><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중국 둔황석굴 벽화의 비천상</span></strong></p><p><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trong><span class="c-description" style="color: rgb(0, 0, 0);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가운데의 동왕공을 수많은 비천들이 호위하며 하늘을 날고 있다. 중국 고유의 신선사상과 외래의 불교사상이 병존하고 있는 그림이다.</span></p><p><span class="c-description" style="color: rgb(0, 0, 0);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p></div><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중국 비천상의 도상적인 특징은 양 팔뚝에 표대(</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飄</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帶</span><span style="color: rgb(0, 0, 0);">) 또는 박대(</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博</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帶</span><span style="color: rgb(0, 0, 0);">)라고 하는 넓고 긴 띠를 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바람을 타고 휘날리고 있는 이 띠가 바로 허공 이동의 수단이다. 양팔 사이에 걸친 표대의 중간 부분은 날아올라 머리 위에서 원형을 그리고 있으며, 양끝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결을 따라 흐르면서 경쾌하고 율동적인 곡선을 연출하고 있다.</span></p><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br></p><div class=" thmb fr" style="width: 255px;"><p><br></p><p><a href="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97354&amp;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04609_A84YDV3I0.jpg%2Fed125_8_i4.jpg%3Ftype%3Dm4500_4500_fst_n%26wm%3DY" target="_blank"><img width="255" height="349" alt="상원사 범종의 비천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04609_A84YDV3I0.jpg%2Fed125_8_i4.jpg%3Ftype%3Dw255_fst_n%26wm%3DY" data-seq="2" data-title="상원사 범종의 비천상" origin_src="http://dbscthumb.phinf.naver.net/2743_000_1/20130925180804609_A84YDV3I0.jpg/ed125_8_i4.jpg?type=m4500_4500_fst_n&amp;wm=Y" origin_width="797" origin_height="1091" source="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hastitle="N" desc="허공에서 수공후와 생황을 연주하고 있는 주악비천상으로, 우리나라 범종에 새겨진 비천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a></p><p class="thmb_desc"><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상원사 범종의 비천상</span></strong></p><p class="thmb_desc"><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trong><span class="c-description" style="color: rgb(0, 0, 0);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허공에서 수공후와 생황을 연주하고 있는 주악비천상으로, 우리나라 범종에 새겨진 비천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span></p></div><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중국에서 매력적인 선녀의 모습으로 변신한 비천상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불교와 함께 수입되었다. 고구려 고분에서부터 시작하여 불교미술에 수용된 비천상은 약간의 양식 변천을 거치면서 한국적인 비천상으로 정착되었다. 현존하는 비천상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을 꼽는다면 단연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 범종의 비천상일 것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상원사 범종은 725년에 제작된 신라의 종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最</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古</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종이다. 국보 제3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보존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신 복제품을 만들어놓고 예불 시간에 맞추어 타종하고 있다. 상원사 범종의 규모는 별로 크지 않지만, 수많은 비천상이 종 표면의 요소요소에 새겨져 있어 비천의 군무(</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群</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舞</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연상케 한다. 특히 종복(</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鐘</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腹</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앞뒤에 각각 새겨진 한 쌍의 비천상은 매우 정교하여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이 종에 새겨진 비천은 각기 무릎을 세우고 허공에 뜬 채 수공후(</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竪</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31644;</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31692;</span><span style="color: rgb(0, 0, 0);">)</span><a class="word_sup"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7354&amp;cid=42661&amp;categoryId=42661&amp;expCategoryId=42661#footNote2"><sup id="footNoteSrc2"><u><font color="#0066cc" size="2"><span style="color: rgb(0, 0, 0);">2)</span></font></u></sup></a><span style="color: rgb(0, 0, 0);">와 생황(</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笙</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簧</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을 연주하고 있는데, 상승 기류를 타고 위쪽으로 휘날리는 천의 자락이 매우 가볍고 유려한 느낌을 준다. 천의의 띠 끝부분은 인동(</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忍</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冬</span><span style="color: rgb(0, 0, 0);">) 모양을 하고 있어 장식적인 효과를 한층 더해준다. 그런데 비천이 연주하고 있는 수공후는 우리 고유의 악기가 아니라 서역 계통의 악기이다. 이렇듯 상원사 범종에 수공후가 등장하는 것은 비천상의 형식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사람들은 보통 이 종복의 비천상만 보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지만 종 표면의 도처에 숨어 있는 비천상도 그냥 지나쳐볼 것이 아니다. 상대(</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上</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帶</span><span style="color: rgb(0, 0, 0);">)에는 반달 모양의 권역(</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圈</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域</span><span style="color: rgb(0, 0, 0);">) 속에 피리와 쟁(</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箏</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을 연주하는 2구의 작은 비천상이 종의 둘레를 돌아가며 촘촘히 새겨져 있고, 하대(</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下</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帶</span><span style="color: rgb(0, 0, 0);">)에도 피리 등의 취악기와 장구, 비파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이 조각되어 있다. 또한 유곽(</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乳</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廓</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띠 아래 부분과 좌우에도 생황과 요고(</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腰</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鼓</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가진 비천상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모든 비천상들이 동시에 춤을 추며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면 실로 환상적이지 않을 수 없다.</span></p><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br></p><div class=" thmb fr" style="width: 197px;"><a href="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97354&amp;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04828_9Z1I14EH1.jpg%2Fed125_8_i5.jpg%3Ftype%3Dm4500_4500_fst_n%26wm%3DY" target="_blank"><img width="197" height="238" alt="실상사 범종의 비천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04828_9Z1I14EH1.jpg%2Fed125_8_i5.jpg%3Ftype%3Dw197_fst_n%26wm%3DY" data-seq="3" data-title="실상사 범종의 비천상" origin_src="http://dbscthumb.phinf.naver.net/2743_000_1/20130925180804828_9Z1I14EH1.jpg/ed125_8_i5.jpg?type=m4500_4500_fst_n&amp;wm=Y" origin_width="343" origin_height="415" source="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hastitle="N" desc="상원사 범종의 비천상에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비천상이다. 결가부좌한 비천이 피리와 생황을 연주하고 있다."></a><p class="thmb_desc"><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실상사 범종의 비천상</span></strong></p><p class="thmb_desc"><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trong><span class="c-description" style="color: rgb(0, 0, 0);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상원사 범종의 비천상에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비천상이다. 결가부좌한 비천이 피리와 생황을 연주하고 있다.</span></p><p class="thmb_desc"><span class="c-description" style="color: rgb(0, 0, 0);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br></span></p></div><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상원사 범종의 비천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실상사 범종에 새겨진 비천상이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실상사 범종은 1967년 실상사 경내에서 파편으로 출토되었는데, 새겨져 있는 한 쌍의 비천상이 매우 우아하고 아름답다.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종의 파편을 보면, 결가부좌한 한 쌍의 주악비천상이 서로 마주 보며 피리와 생황을 연주하고 있다. 둘 다 보관(</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寶</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冠</span><span style="color: rgb(0, 0, 0);">)과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를 갖추었는데, 상반신은 나신으로 천의를 휘날리고 있으며 천의 사이에는 각 2조의 영락(</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瓔</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珞</span><span style="color: rgb(0, 0, 0);"> ; 구슬 장식)이 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한국전쟁 때 파괴된 신라 선림원 종의 비천상 또한 유명하다. 이 비천상은 구름 위의 연화좌에 앉아 천의 자락을 바람에 날리면서 하늘을 날고 있다. 그러나 상원사와 실상사 범종의 비천상에서 볼 수 있는 영락은 찾아볼 수 없으며, 향(</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向</span><span style="color: rgb(0, 0, 0);">) 좌측의 비천은 횡적(</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橫</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笛</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을 불고 있고, 우측은 양손을 크게 벌려 요고를 치고 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이상에서 살펴본 범종의 비천상은 모두 주악비천상이지만 국립경주박물관 뜰에 있는 성덕대왕신종의 비천상은 공양비천상이다. 보상화(</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寶</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相</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華</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가 구름같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구름 위에 있는 연화좌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천상의 바람에 옷자락과 영락을 휘날리면서 두 손 모아 공양하는 자태이다. 이 종에 공양비천상을 새긴 것은 성덕대왕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span></p><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br></p><div class="thmb_txt div_center" style="width: 610px;"><div style="margin: 0px auto; width: 610px;"><div class="thmb c" style="width: 300px;"><a href="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97354&amp;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07270_DNRJPB1AD.jpg%2Fed125_8_i6.jpg%3Ftype%3Dm4500_4500_fst_n%26wm%3DY" target="_blank"><img width="300" height="504" alt="성덕대왕신종의 공양비천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07270_DNRJPB1AD.jpg%2Fed125_8_i6.jpg%3Ftype%3Dw300_fst_n%26wm%3DY" data-seq="4" data-title="성덕대왕신종의 공양비천상" origin_src="http://dbscthumb.phinf.naver.net/2743_000_1/20130925180807270_DNRJPB1AD.jpg/ed125_8_i6.jpg?type=m4500_4500_fst_n&amp;wm=Y" origin_width="769" origin_height="1294" source="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hastitle="N" desc="연화좌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공양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성덕대왕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만든 종이기 때문에 공양비천상을 새겼다."></a><p class="thmb_desc" style="width: 295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trong class="c-title"><span style="color: rgb(0, 0, 0);">성덕대왕신종의 공양비천상</span></strong><span class="c-description" style="color: rgb(0, 0, 0);">연화좌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공양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성덕대왕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만든 종이기 때문에 공양비천상을 새겼다.</span></p></div><div class="thmb last c" style="width: 300px;"><a href="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97354&amp;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15195_0NU8QXV7R.jpg%2Fed125_8_i7.jpg%3Ftype%3Dm4500_4500_fst_n%26wm%3DY" target="_blank"><img width="300" height="504" alt="용주사 범종의 공양비천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15195_0NU8QXV7R.jpg%2Fed125_8_i7.jpg%3Ftype%3Dw300_fst_n%26wm%3DY" data-seq="5" data-title="용주사 범종의 공양비천상" origin_src="http://dbscthumb.phinf.naver.net/2743_000_1/20130925180815195_0NU8QXV7R.jpg/ed125_8_i7.jpg?type=m4500_4500_fst_n&amp;wm=Y" origin_width="769" origin_height="1294" source="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hastitle="N" desc="비천상의 머리 위로 흩날리며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하는 표대가 인상적이다."></a><p class="thmb_desc" style="width: 295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p><strong class="c-title"><span style="color: rgb(0, 0, 0);">용주사 범종의 공양비천상</span></strong></p><p><strong class="c-title"></strong><span class="c-description" style="color: rgb(0, 0, 0);">비천상의 머리 위로 흩날리며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하는 표대가 인상적이다.</span></p></div></div><div class="clear_float"></div></div><div class="clear_float"></div><div class="thmb c"><a href="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97354&amp;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1015181337549_I615LUBGV.jpg%2Fed125_8_i8.jpg%3Ftype%3Dm4500_4500_fst_n%26wm%3DY" target="_blank"><img width="460" height="353" alt="송광사 대웅전의 비천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1015181337549_I615LUBGV.jpg%2Fed125_8_i8.jpg%3Ftype%3Dw460_fst_n%26wm%3DY" data-seq="6" data-title="송광사 대웅전의 비천상" origin_src="http://dbscthumb.phinf.naver.net/2743_000_1/20131015181337549_I615LUBGV.jpg/ed125_8_i8.jpg?type=m4500_4500_fst_n&amp;wm=Y" origin_width="600" origin_height="461" source="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hastitle="N" desc=""></a><p class="thmb_desc" style="width: 455px;"><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송광사 대웅전의 비천상</span></strong></p></div><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목조 조각품으로는 화성 용주사 대웅전 천장과 완주 송광사 대웅전 천장에 매달려 있는 비천상이 유명하다. 그밖에 </span><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7351&amp;ref=y"><u><font color="#0066cc"><span style="color: rgb(0, 0, 0);">연꽃</span></font></u></a><span style="color: rgb(0, 0, 0);">봉오리를 들고 있는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등의 비천상과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의 비천상, 정토사 홍법국사실상탑(경복궁 소재)의 지붕돌 밑면에 새겨진 비천상, 경북대학교 박물관 석조</span><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7377&amp;ref=y"><u><font color="#0066cc"><span style="color: rgb(0, 0, 0);">부도</span></font></u></a><span style="color: rgb(0, 0, 0);">의 비천상 등 적지 않은 비천상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그림으로는 영덕 장륙사 대웅전 천장의 비천상이 유명하다.</span></p><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p><div class="clear_float"></div><div class="thmb c"><a href="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97354&amp;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18267_YQJX4O3C9.jpg%2Fed125_8_i9.jpg%3Ftype%3Dm4500_4500_fst_n%26wm%3DY" target="_blank"><img width="492" height="328" alt="신륵사 보제존자석등의 비천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18267_YQJX4O3C9.jpg%2Fed125_8_i9.jpg%3Ftype%3Dw492_fst_n%26wm%3DY" data-seq="7" data-title="신륵사 보제존자석등의 비천상" origin_src="http://dbscthumb.phinf.naver.net/2743_000_1/20130925180818267_YQJX4O3C9.jpg/ed125_8_i9.jpg?type=m4500_4500_fst_n&amp;wm=Y" origin_width="1194" origin_height="796" source="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hastitle="N" desc="석등의 화사석 8면에 하늘을 날며 공양하는 환상적인 모습의 비천상을 새겼다."></a><p class="thmb_desc" style="width: 487px;"><p><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신륵사 보제존자석등의 비천상</span></strong></p><p><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trong><span class="c-description" style="color: rgb(0, 0, 0);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석등의 화사석 8면에 하늘을 날며 공양하는 환상적인 모습의 비천상을 새겼다.</span></p></div><div class="thmb_txt div_center" style="width: 492px;"><h3><span style="color: rgb(0, 0, 0);">장륙사 대웅전 천장의 비천상</span></h3><div style="margin: 0px auto; width: 492px;"><div class="thmb last c" style="width: 492px;"><a href="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97354&amp;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750842_3D39ANWR4.jpg%2Fed125_8_i1.jpg%3Ftype%3Dm4500_4500_fst_n%26wm%3DY" target="_blank"><img width="492" height="292" alt="장륙사 대웅전 천장의 비천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750842_3D39ANWR4.jpg%2Fed125_8_i1.jpg%3Ftype%3Dw492_fst_n%26wm%3DY" data-seq="8" data-title="" origin_src="http://dbscthumb.phinf.naver.net/2743_000_1/20130925180750842_3D39ANWR4.jpg/ed125_8_i1.jpg?type=m4500_4500_fst_n&amp;wm=Y" origin_width="1194" origin_height="710" source="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hastitle="Y" desc=""></a></div></div><div class="clear_float"></div><div style="margin: 0px auto; width: 492px;"><div class="thmb last c" style="width: 492px;"><a href="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97354&amp;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751598_QNV69F7F2.jpg%2Fed125_8_i2.jpg%3Ftype%3Dm4500_4500_fst_n%26wm%3DY" target="_blank"><img width="492" height="292" alt="장륙사 대웅전 천장의 비천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751598_QNV69F7F2.jpg%2Fed125_8_i2.jpg%3Ftype%3Dw492_fst_n%26wm%3DY" data-seq="9" data-title="" origin_src="http://dbscthumb.phinf.naver.net/2743_000_1/20130925180751598_QNV69F7F2.jpg/ed125_8_i2.jpg?type=m4500_4500_fst_n&amp;wm=Y" origin_width="1194" origin_height="710" source="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hastitle="Y" desc=""></a></div></div><div class="clear_float"></div><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하늘을 날며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의 환상적인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비천상은 표대라고 하는 넓고 긴 띠를 두르고 있는데, 하늘을 날 때 이 띠를 사용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 유남해</span><div class="autosourcing-stub"><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color: black;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p></div></div><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color: black;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strong>비천상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strong></span></p></div><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조형물로서의 비천상 그 자체는 그냥 그렇게 존재할 뿐 아무런 생명도 활기도 없다. 눈에 보이는 모습 이외에 감성적으로 전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아름다운 음악이 퍼져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천의가 휘날리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관조(</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觀</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照</span><span style="color: rgb(0, 0, 0);">)할 때는 단순한 조형물 이상의 그 무엇을 보게 된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관조의 상태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비천상에서 생명을 보며 천의와 구름이 허공을 날고 있음을 느낀다. 그 속에서 단순한 장식 조형물의 차원을 넘는 전혀 별개의 그 무엇을 감지하게 된다. 만약 불심이 돈독하고 비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불자라면 그 속에서 비천의 자유롭고 환희에 찬 움직임과 울려 퍼지는 미묘한 음악소리를 느낄 것이며, 비천이 비행하는 불국정토의 정경을 마음속에 그려낼 것이다.</span></p><div class="thmb c"><a href="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97354&amp;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22972_2H366B66W.jpg%2Fed125_8_i10.jpg%3Ftype%3Dm4500_4500_fst_n%26wm%3DY" target="_blank"><img width="492" height="266" alt="범어사 대웅전의 비천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22972_2H366B66W.jpg%2Fed125_8_i10.jpg%3Ftype%3Dw492_fst_n%26wm%3DY" data-seq="10" data-title="범어사 대웅전의 비천상" origin_src="http://dbscthumb.phinf.naver.net/2743_000_1/20130925180822972_2H366B66W.jpg/ed125_8_i10.jpg?type=m4500_4500_fst_n&amp;wm=Y" origin_width="1194" origin_height="646" source="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hastitle="N" desc="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주악비천상으로, 표대가 있으나 소략하게 표현되었다."></a><p class="thmb_desc" style="width: 487px;"><p><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범어사 대웅전의 비천상</span></strong></p><p><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trong><span class="c-description" style="color: rgb(0, 0, 0);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주악비천상으로, 표대가 있으나 소략하게 표현되었다.</span><span class="c-description" style="color: rgb(0, 0, 0);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p></div><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p><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종이 감싸고 있는 안쪽의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소리는 나지 않으나 모든 소리가 그 속에 응결, 함축되어 있다. 이 침묵을 깨는 것이 바로 타종이다. 당(</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撞</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이 당좌(</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撞</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座</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때리면 그 진동으로 응결되어 있던 소리들이 용해되어 울려 퍼진다. 그와 함께 비천상도 깨어나 환상적인 음악을 쏟아낸다. 진동이 그치면 또다시 침묵 속에 응결된다. 현상계에서 다시 궁극(</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窮</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極</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span></p><div class="thmb c"><a href="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97354&amp;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24647_8C7GSRK3W.jpg%2Fed125_8_i11.jpg%3Ftype%3Dm4500_4500_fst_n%26wm%3DY" target="_blank"><img width="492" height="170" alt="범어사 대웅전 불단의 비천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43_000_1%2F20130925180824647_8C7GSRK3W.jpg%2Fed125_8_i11.jpg%3Ftype%3Dw492_fst_n%26wm%3DY" data-seq="11" data-title="범어사 대웅전 불단의 비천상" origin_src="http://dbscthumb.phinf.naver.net/2743_000_1/20130925180824647_8C7GSRK3W.jpg/ed125_8_i11.jpg?type=m4500_4500_fst_n&amp;wm=Y" origin_width="780" origin_height="270" source="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hastitle="N" desc="불단을 장엄하는 이 비천상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과 그를 모시는 환희심의 표현이다."></a><p class="thmb_desc" style="width: 487px;"><p><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범어사 대웅전 불단의 비천상</span></strong></p><p><strong class="c-title"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trong><span class="c-description" style="color: rgb(0, 0, 0);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불단을 장엄하는 이 비천상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과 그를 모시는 환희심의 표현이다.</span></p></div><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p><p class="txt"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color: rgb(0, 0, 0);">불자들은 관념을 상징화하거나 시각화하고, 조형화된 것으로부터 다시 관념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범종의 비천상도 부처님과 불국정토에 대한 공경심과 환희심의 구상적(</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具</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象</span><span class="word_dic hj" style="color: rgb(0, 0, 0);">的</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우리들이 그 배후에 감추어진 세계를 감지해내지 못한다면 비천상은 시각적 장식의 속성만을 지닌 단순한 조형물로 전락해버릴 것이다.</span></p><div class="box_footnote opened"><h3><span style="color: rgb(0, 0, 0);">각주</span></h3><ol><li class="frst" id="footNote1"><em><span style="color: rgb(0, 0, 0);">1</span></em><span style="color: rgb(0, 0, 0);"> 제석천: 불교 우주관의 중심 산인 수미산 정상부에 있는 도리천의 제왕.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span></li><li id="footNote2"><em><span style="color: rgb(0, 0, 0);">2</span></em><span style="color: rgb(0, 0, 0);"> 수공후: 사다리꼴 모양의 틀에 길이가 다른 21개의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로, 하프처럼 음색이 곱고 음량이 크다. </span><div class="autosourcing-stub"><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color: black;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br></p></div></li></ol></div></div><p><br></p><p><br></p><p><br></p>
<!-- -->
카페 게시글
불교미술
비천상~부처의 소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선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