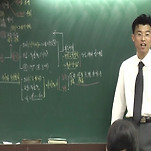<!--StartFragment--><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Q.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통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94p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관련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업하실 때 연개소문 사후 귀족 내부의 분열로 고구려가 멸망한것이지 형제의 내분으로 멸망한것이 아니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남생 남건 남산의 분열도 형제인데 그냥 귀족 내부의 분열로 봐야되는 건가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line-height: 120%; margin-bottom: 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nbsp;<!--[if !supportEmptyParas]-->&nbsp;</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구려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31</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안장왕</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安藏王</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피살되고</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어 안원왕</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安原王</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말년에는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귀족 간의 내분이 크게 폭발했던 것이다</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귀족 간의 내분은 강력한 일원적 집권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병집단을 거느린 귀족들이 상호 타협하여 실력자의 직책인 대대로</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大對盧</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선임하는 귀족연립정권체제를 형성</span></u><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중에 강력한 독재정치를 실시했던 연개소문</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淵蓋蘇文</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파의 세력도 근본적으로는 이 체제를 벗어나지는 못했다</span></u><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특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p71&g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으로 고립에 빠진 신라는 당나라와의 연결을 시도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침내 두 나라는 연합군을 형성하여 통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통일전쟁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첫째 단계는 나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3759;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연합군과 백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구려왕의 전쟁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66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으나 백제는 이미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이듬해부터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고구려가 이를 방어했으나 자체 내분으로 인해 결국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68</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멸망하고 말았다</span></u><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특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p72&g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때 마침 고구려의 집권층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6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연개소문이 죽고 장자 남생이 대막리지가 되어 정권을 잡자 두 동생 남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男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남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男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힘을 합쳐 남생을 몰안고 남거니 스스로 대막리지가 되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에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남생은 옛서울인 국내성</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 통구</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달아나 당에 원군을 청하였던 것이다</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같은 해에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淵淨土</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城</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들어 신라에 투항함으로써 고구려는 자체분열로 약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span></u><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통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p94&g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구려는 당나라의 공격을 근근히 막아내었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싸움의 형세는 점점 불리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당나라는 이미 고구려 주요 성 등을 장악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라에서 군량까지 보급받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더구나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66</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는 연개소문이 죽어 그 아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 고구려의 전력은 크게 떨여졌다</span></u><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연개소문의 장남 남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男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아버지의 지위 태막리지를 이어받았으나 동생 남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男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남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男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축출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자 남생은 국내성 등 성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를 거느리고 당나라에 투항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에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淵淨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 휘하의 성 열둘을 이끌고 신라에 항복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6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이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3969;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와 김인문이 이끄는 신라군이 평양성을 총공격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평양성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월여 저항했으나 결국 함락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뿌샘 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p262&g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구려 장수왕의 손자 문자명왕 이후 안장왕 피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안원왕 말기 왕위 쟁탈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원왕기 왕권 실추 등 귀족연립정권체제의 형성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이후 연개소문이 정변을 통해 영류왕을 제거하고 보장 옹립과 본인이 대막리지로 권력의 정점을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고구려 사회가 이렇듯 내적으로 귀족연립정치기에 외적으로 중국의 통일에 이은 위협에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0</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년간 국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영양왕 이후 연개소문이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귀족연립정치기의 중앙집권화를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연개소문 사후 연개소문의 아들 들에 의한 내분 자체는 보여지는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시말해 연개소문기 자신의 세를 감추고 있어야 했던 귀족들이 제각기 남생 및 남산이라는 과거사적 명분론을 중심으로 분열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강의 중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단순한 권력 쟁탈전이 아니라 귀족들의 이반에 이은 권력 쟁탈전이 연남생 형제들의 권력 쟁탈전으로 보여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귀족들의 권력 쟁탈전입니다</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했던 것입니다</span></u><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br></p>
<!-- -->
카페 게시글
수업 질문&답 (Q&A)
교수답변
고구려 귀족연립정권체제 - 연남생, 남건, 남산 형제 내분
벽난로
추천 0
조회 207
16.03.10 01:1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