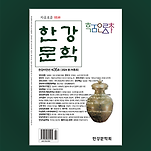<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나무를&#160;배우자</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김 용 언</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넉넉한&#160;평지에서도,&#160;고꾸러질듯한&#160;비탈에서도&#160;직립하는&#160;나무를&#160;배우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쪽으로 기우뚱하지만 그럴수록&#160;뿌리를&#160;땅&#160;속&#160;깊히&#160;드리우는&#160;나무를&#160;배우자</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산다는 것이 고달프다고 말하는 인간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초록 잎을 틔우고 가을이면 잎 떨궈 제 발등을 덮어 겨울을 이겨내는 나무를 배우자</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시詩가 빵이 되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시인도 살다보면 외롭기도하고 아프기도&#160;한&#160;걸&#160;보며&#160;상처&#160;난&#160;자리에&#160;옹이를&#160;키우는&#160;나무를&#160;배우자</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모여서 숲을 이루고 다른 나무 씨앗이 떨어지면 땅을 내어주는 넉넉함도 배우자 </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인간의 삶이 백년 전후라지만 나무는 베푸는 마음이 넉넉하여 백년 천년지나도&#160;새로운&#160;잎을&#160;틔우는&#160;나무의&#160;사랑법을&#160;배우자 </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시낭송으로 사람 마음을 적셔주는 한국 시낭송 1인자라는 박영애 시인도 눈부시지만, 젊은 시로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비아 시인도 있지만 나무는&#160;숲을&#160;이뤄도&#160;거만함을&#160;숨기고&#160;산다 </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홍아무개 작가도 있지만 나무의 깊은 겸손은 두손을&#160;모으게&#160;한다 </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홀로 서 있어도 한 폭의 풍경화가 되고 숲을 이뤄도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나무의 품위가 눈부시다</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나무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물보다&#160;깊고&#160;불보다&#160;뜨거운&#160;나무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시인,&#160;수필가,&#160;소설가의&#160;가슴에&#160;뿌리를&#160;내려&#160;메말라&#160;가는&#160;인간의&#160;가슴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벅차게&#160;해다오.</span></p><p>&#160;</p><p>&#160;</p><p>&#160;</p><p>&#160;</p><hr data-ke-style="style7"><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09B/01346b7c1d06e040f40b1277cfbb19a5a33cda87" class="txc-image" width="150" height="16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09B/01346b7c1d06e040f40b1277cfbb19a5a33cda87" data-origin-width="472" data-origin-height="532"></div><p style="text-align: center;">동국대&#160;국문과&#160;졸업,&#160;《시문학》으로&#160;등단(문덕수,&#160;김종길&#160;2회&#160;추천) <br>시문학회&#160;회장,&#160;한국문인협회&#160;시분과&#160;회장(역임),&#160;한국현대시인협회&#160;이사장(역임),&#160;한국 <br>현대문학작가연대&#160;이사장,&#160;《현대작가》&#160;발행인</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작가의&#160;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글을&#160;쓰면서도&#160;글을&#160;쓰는&#160;목적에&#160;대해&#160;회의를&#160;느낄&#160;때가&#160;많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독자를 위해 글을 쓰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쓰</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는&#160;것인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삶의&#160;무게를&#160;스스로&#160;저울질하게&#160;된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결론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최종 도달점은 독자라는 걸 느끼게 된</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글을&#160;쓴다는&#160;것은&#160;공감&#160;혹은&#160;감정의&#160;공유자를&#160;찾아&#160;나서는&#160;길이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물론 글을 쓴다는 것은 고독한 작업이다. 록클라이밍 오버행 코스 중간</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에&#160;매달려&#160;밤을&#160;침낭&#160;속에서&#160;날이&#160;밝기를&#160;기다려야할&#160;때가&#160;있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밤새 근육이 굳을까 꼼지락거리며 손과 발가락을 꿈틀거리며 머리를 회</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전시켜야하는&#160;작업이요&#160;노동이다.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나는&#160;젊었을&#160;때&#160;외간&#160;여자를&#160;가슴에&#160;품은&#160;적이&#160;있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그 당시에 썼던 글들은 뜨거웠다. 뜨겁기는 했지만 감동이 적었다. 열정</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만으로 글이 될 수 없다는 걸 시간이 지난 후 깨달았다. 마음의 여유가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있어야&#160;감정의&#160;공유&#160;혹은&#160;공감을&#160;할&#160;수&#160;있는&#160;것이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그러나&#160;가끔&#160;뜨거워지고&#160;싶어질&#160;때가&#160;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청춘이라는&#160;것은&#160;뜨겁기&#160;때문이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허홍구&#160;시인의&#160;〈봄〉이라는&#160;시가&#160;공명력을&#160;높힌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평범하면서도&#160;부끄러움을&#160;깨닫고&#160;싶은&#160;마음이&#160;도사리고&#160;있기&#160;때문이다.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꽃망울&#160;터지는&#160;봄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선생님은 참 재밌고 젊어 보여요”</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내&#160;팔에&#160;매달리는&#160;꽃이&#160;있다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스물한&#160;살&#160;젊디젊은&#160;여인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묵은&#160;가지&#160;겨드랑이&#160;가렵더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새순&#160;돋는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아무래도&#160;이번&#160;봄에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꽃밭에&#160;넘어질&#160;것&#160;같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꼭,&#160;넘어질&#160;것&#160;같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4">&#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65293;허홍구 〈봄〉 전문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작가에게는 봄날 같은 마음이 있어야 현상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상상의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날개도 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시 한편으로 작가의 글쓰기 변을 마무</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6">리한다.</span></p>
<!-- -->
카페 게시글
권두시, 원로초대석
김용언/ 나무를 배우자 ≪한강문학≫ 29호 권두시
이혜경
추천 0
조회 25
22.12.21 13:1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