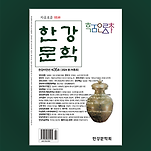<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Center" style="width: 70.0495%; height: 494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494px;"><td style="width: 100%; height: 494px; text-align: justify;">《한강문학》은&#160;성기조&#160;박사의&#160;〈권두문학강좌〉(문예사조)를&#160;분재(29호까지,&#160;가을호, <br>2022)하여&#160;문학도의&#160;높은&#160;호응을&#160;받으며&#160;대장정을&#160;마쳤다.&#160;이어서&#160;30호(2023,&#160;신년호) <br>부터는&#160;원교員嶠&#160;이광사李匡師의&#160;〈동국악부〉를&#160;게재하기로&#160;편집회의에서&#160;결정하였다.<br><br>원교&#160;이광사는&#160;《서결書訣》을&#160;남기고&#160;〈동국진체東國晉體〉를&#160;확립한&#160;서법가書法家 <br>이며&#160;강화학의&#160;정신을&#160;문학과&#160;논문으로&#160;표출한&#160;문학가이자&#160;사상가이다.&#160;그러나&#160;미술 <br>사학의&#160;분야에서&#160;크게&#160;주목을&#160;받아온&#160;명성에&#160;못지않은&#160;문학,&#160;학술사상에&#160;관해서는&#160;연 <br>구나&#160;평가가&#160;까닭&#160;모르게&#160;부족하여&#160;왔다.<br><br>그리하여&#160;강화학파&#160;학맥을&#160;세운&#160;하곡霞谷&#160;정제두鄭齊斗에서부터,&#160;해방&#160;이후&#160;담원 <br>정인보로&#160;이어지는&#160;한국&#160;철학사상의&#160;진정한&#160;큰&#160;맥脈을&#160;이어가기에,&#160;오늘날&#160;숨&#160;가쁜 <br>지경에&#160;이르렀다는&#160;판단에&#160;따라,&#160;원교의&#160;문학,&#160;학술사상이&#160;고스란히&#160;녹아있는&#160;〈동국 <br>악부〉를&#160;분재하기로&#160;결정하게&#160;됐다.<br><br>〈동국악부〉에&#160;담긴&#160;사상은&#160;한민족의&#160;시원과&#160;미래를&#160;밝히면서,&#160;시가詩歌에&#160;담긴&#160;철 <br>학은&#160;심오할&#160;뿐만&#160;아니라&#160;분량에&#160;있어서도&#160;방대하여,&#160;문학도의&#160;이해를&#160;돕기&#160;위한&#160;방 <br>편으로&#160;부득이&#160;분재를&#160;결정할&#160;수밖에&#160;없었음을&#160;밝힌다.&#160;아울러&#160;〈동국악부〉에&#160;담긴&#160;선 <br>현의&#160;뜻을&#160;재해석하여&#160;옮기는&#160;것만&#160;하여도&#160;벅차올라,&#160;낯빛을&#160;가다듬고&#160;심지를&#160;한층 <br>끌어올려&#160;선각,&#160;선현의&#160;철학과&#160;사상을&#160;옮김에&#160;있어서&#160;용두사미龍頭蛇尾가&#160;되지&#160;않도 <br>록&#160;정진할&#160;것임을&#160;밝힌다.<br><br>〈권두문학강좌〉를&#160;통해&#160;원교를&#160;지상紙上에&#160;드러내기로&#160;결정하기까지에는&#160;한강문 <br>학&#160;편집고문님들의&#160;격려와&#160;도움&#160;그리고&#160;담원&#160;정인보님의&#160;자제분&#160;정양완&#160;박사의&#160;걸작 <br>《강화학파의&#160;문학과&#160;사상(2)》(한국정신문화연구원,&#160;1995)에&#160;전적으로&#160;의존하였음을 <br>밝힌다.〈편집자〉</td></tr></tbody></table></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09B/ece5946d9270f58275ddc4cb8feb353cd4bcff72_re_1703759349484" class="txc-image" width="625" height="78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09B/ece5946d9270f58275ddc4cb8feb353cd4bcff72_re_1703759349484" data-origin-width="1772" data-origin-height="2215"><div class="figcaption">원교員嶠 초상화(국립박물관 소장)-임오壬午(영조, 1762)년 부령富寧에서 신지도薪智島로 귀양지를 옮겨 정유丁酉(1777) 8월 26일,그 섬의 금실촌金實村 우사寓舍(객사)에서 돌아가니 나이 일흔 셋이었다. 이 초상화는 바로 일흔 살 갑오甲午(1774) 겨울에 화사&#30059;師 신한평申漢枰의 그림이다. 8월 28일은 곧 선생의 생신이다. 선생은 신지도에 있을 때 ‘수북노인壽北老人’이라 자칭하였다(원교 자신이 8월 회晦 경신庚申에 태어났다 하였는데, 8월 경신일은 바로 29일이다).</div></div><p>&#160;</p><p>&#160;</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64px;" border="1" data-ke-style="style16"><tbody><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100%; height: 18px;" colspan="2"><span data-ke-size="size20"> 〈동국악부東國樂府〉-전체&#160;목차<br><br></span></td></tr><tr style="height: 0px;"><td style="width: 50%; height: 46px;" rowspan="2"><span data-ke-size="size18"> 1.&#160;태백단太伯檀-30호&#160;게재</span><br><span data-ke-size="size18">2.&#160;황하가黃河歌-30호&#160;게재</span><br><span data-ke-size="size18">3.&#160;성모사聖母祠-30호&#160;게재</span><br><span data-ke-size="size18">4.&#160;임중계林中鷄-31호&#160;게재</span><br><span data-ke-size="size18">5.&#160;우식곡憂息曲-31호&#160;게재</span><br><span data-ke-size="size18">6.&#160;치술령&#40260;述嶺-31호&#160;게재</span><br><span data-ke-size="size18">7.&#160;황창무黃昌舞-32호&#160;게재</span><br><span data-ke-size="size18">8.&#160;참마항斬馬&#34902;-32호&#160;게재</span><br><span data-ke-size="size18">9.&#160;왕무거王母去-32호&#160;게재</span><br><span data-ke-size="size18">10.&#160;양산가陽山歌-34호&#160;게재</span><br><span data-ke-size="size18">11.&#160;파경합破鏡合-34호&#160;게재</span><br><span data-ke-size="size18">12.&#160;조촉사朝蜀使-34호&#160;게재</span><br><span data-ke-size="size18">13.&#160;현학금玄鶴琴</span><br><span data-ke-size="size18">14.&#160;만파식적萬波息笛</span><br><span data-ke-size="size18">15.&#160;월명항月明&#34902; </span></td><td style="width: 50%; height: 46px;" rowspan="2"><span data-ke-size="size18"> 16.&#160;상서장上書莊</span><br><span data-ke-size="size18">17.&#160;포석정鮑石亭</span><br><span data-ke-size="size18">18.&#160;조룡대釣龍臺</span><br><span data-ke-size="size18">19.&#160;낙화암落花巖</span><br><span data-ke-size="size18">20.&#160;조촌석朝天石</span><br><span data-ke-size="size18">21.&#160;융수첩薩水捷</span><br><span data-ke-size="size18">22.&#160;성상배城上拜</span><br><span data-ke-size="size18">23.&#160;영서기迎&#33564;旗</span><br><span data-ke-size="size18">24.&#160;절영마絶影馬</span><br><span data-ke-size="size18">25.&#160;창근경昌瑾鏡</span><br><span data-ke-size="size18">26.&#160;성제대聖帝帶</span><br><span data-ke-size="size18">27.&#160;문곡성文曲星</span><br><span data-ke-size="size18">28.&#160;백사가百死歌</span><br><span data-ke-size="size18">29.&#160;여재립女戴笠</span><br><span data-ke-size="size18">30.&#160;두문동杜門洞 </span></td></tr></tbody></table></div><p>&#160;</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Center" style="width: 66.7934%; height: 108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108px;"><td style="width: 100%; height: 108px;">&#160;* 본고는 《江華學派의 文學과 思想(2)》(鄭良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초판 <br>&#160;본) 중 〈圓嶠와 信齋의 東國樂府〉를 모본母本으로 삼아 윤문하였음을 밝힙니다) <br>&#160;* 《한강문학》에 게재한 〈동국악부〉의 내용 중 ‘원교와 신재의 시’ 번역은 桑谷 <br>&#160;이기운(시조시인, 문학평론가) 선생께서 맡아주셨음을 밝힙니다.</td></tr></tbody></table></div><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동국악부東國樂府〉-해설</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동국악부〉는 원교의 《두남집斗南集》(권4)에 30수가 실려 있다. 악부에 실린 30수의 제목에서부터 국조國祖 단군檀君을 비롯하여, 고려高麗가 망亡하였을 때 두문수절杜門守節한 역사적 사실과 그로 인한 변곡점에서 민족의 얼을 가늠할 수 있는 본보기를 가려 읊은, 역사의식歷史意識이&#160;두드러지게&#160;드러난&#160;作品들이다.</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동국악부〉에&#160;실린&#160;각각의&#160;수首는&#160;모두&#160;자주自註가&#160;달려&#160;있으며,&#160;원교圓嶠 한 사람만 읊고 만 것이 아니라, 아들 신재信齋에게도 같은 주제主題로 역시 30首의 〈東國樂府〉를 새로이 짓게 하였다. 따라서 《신재집信齋集》 첫머리에 간략한 자주自註와 함께 실려 있음에서도, 원교가 민족의 얼을 아들에게 심어주려 하였고, 그 뜻을 아들이 품고 그에 대한감동을&#160;녹여&#160;읊었던&#160;것이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그리하여 원교員嶠의 〈동국악부〉에 아들 신재信齋가 함께 한 〈동국악부東國樂府〉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질곡을 장엄하고, 숭고하게 그려내며, 때로는 처절悽絶하게 겨레의 발자취를 가려 적어 놓았기에 원교의철학과&#160;사상을&#160;새삼&#160;확인確認하게&#160;된다.</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信齋集》&#160;첫머리의&#160;〈東國樂府〉에&#160;대한&#160;자서自序는&#160;다음과&#160;같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우리 아버지께서 〈東國樂府〉 30편을 지어, 영익令翊으로 하여금 이어 화답和答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영익令翊은 시詩에 능能치 못하고, 억지로 본 딸 수도 없어서, 지을 수는 없건 만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서, 여기 질박質朴하고 촌스러운 말로 엮게 된 터이다. 사적事蹟이 황당괴이荒唐怪異 한데서 나와, 정도正道에서 어긋나 의심疑心스럽고 기롱譏弄 당할 만한 것은 반드시 편제篇題에 기록記錄하고 詩에 드러내어&#160;굴원屈原의&#160;천문天問의&#160;뜻을&#160;스스로&#160;붙이는&#160;터이다”&#160;하였다.</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해동악부海東樂府〉</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조선 후기에 오광운(吳光運)이 지었다. 연작의 영사악부(詠史樂府)이며 28편으로 되어 있다. 그의 문집인 목판본 《약산만고藥山漫稿》(권5)에&#160;수록되어&#160;전한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각 편은 〈태백단太伯檀〉, 〈황하가黃河歌〉, 〈성모사聖母祠〉, 〈임중계林中鷄〉, 〈우식곡(憂息曲〉, 〈치술령&#40260;述嶺〉, 〈황창무黃昌舞〉, 〈참마항斬馬巷〉, 〈왕무거王毋去〉, 〈양산가陽山歌〉, 〈파경합破鏡合〉, 〈조촉사朝蜀使〉, 〈현학금玄鶴琴〉, 〈만파식적萬波息笛〉, 〈월명항月明巷〉, 〈상서장上書莊〉, 〈포석정鮑石亭〉,&#160;〈조룡대釣龍臺〉,&#160;〈낙화암落花巖〉,&#160;〈조천석朝天石〉,&#160;〈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수첩薩水捷〉, 〈절영마絶影馬〉, 〈창근경昌瑾鏡〉, 〈성제대聖帝帶〉, 〈문곡성文曲星〉,&#160;〈백사가百死歌〉,&#160;〈여대립女戴笠〉,&#160;〈두문동杜門洞〉&#160;등&#160;28편이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원교 이광사가 〈동국악부〉를 지을 때 모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동국악부東國樂府〉에는 〈성상배城上拜〉, 〈영천기迎&#33564;旗〉 2편을 더하여&#160;30편으로&#160;되어있다.</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0.&#160;양산가陽山歌</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新羅太宗이 金歆運김흠운을 시켜 陽山에 駐屯하게 하자 百濟가 밤을 타서 쳐들어왔다. 歆運이 말을 빗기 타고서 창을 잡고 대기하자, 시종자가 말을 당기며 피하기를 권하면서 “적이 어둠속에 일어나니, 죽더라도 아는 이도 없으려니와, 게다가 왕이 얼고 녹는 사위요 이 나라의 貴骨이십니다. 만약에 적의 손에 죽는다면 우리의 수치입니다” 하자 흠운이 말하기를 “대장부가 목숨을 나라에 바쳤으면 어찌 남이 알고 모름을 헤아려 마음을 바꾸겠는가” 하고서는 칼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진하여 죽으니 뒤따라 죽은 이가 셋이었으니, 취도, 적득, 보용이었다. 다들 “저분은 귀골인데도 오히려 죽음을 우습게 여기거늘 하물며 나같은 사람일까보냐” 하더라는 것이다. 그 때 사람이 양산가를 지어 哀悼하였다.</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新羅太宗 使金歆運屯陽山 百濟乘夜來襲 歆運橫馬握&#27082; 待之. 從者控馬勸避 曰賊起暗中 雖死 無知者 且公 王之寵&#23167; 國之貴骨 若死敵 我所恥. 欽運 曰大丈夫以身許國 何計人知不知而易心? 揮劍 突陳而死 從死者 三人 曰驟徒 曰狄得 曰寶用. 皆 曰彼貴骨 猶輕死 況如余者? 時人作陽山&#160;哀之.</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나 홀로만 아는 가운데서의 良心에 따르려는 흠운의 마음이 바로 內心修己의 원교의 마음과 交應되는 터이다. 이 마음을 겨레의 마음에 부어&#160;주고&#160;싶은데서&#160;이&#160;詩를&#160;짓게&#160;된&#160;것이리라.</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地勢&#38440;多樹木&#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地勢는 험하고 나무는 우거졌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軍勢孤天夜黑&#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軍勢는 외롭고 밤하늘은 깜깜해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星&#26935;劒&#37003;太白&#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별은 칼날에 담겨 태백성에 나부끼고</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癲風起頓&#26050;角&#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미친바람이 일어나니 깃발 끝이 넘어지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火包山聲震谷&#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병화는 산을 감싸고 소리는 계곡에 천둥소리를 내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敵如潮毆霆雹&#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적은 밀물과 같이 치고 세차고 빠르게 두드리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25890;&#37433;&#25123;雨矢石&#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날선 창과 양지창 몰려들고 화살과 돌은 비처럼 쏟아지는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將軍怒須眉&#25709;&#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장군은 화가 나서 용모를 가다듬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獨上馬&#25757;長&#30687;&#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홀로 말에 올라 긴 창을 높이 휘드르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威如神面魁晳&#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위엄은 신과 같고 얼굴은 북두칠성처럼 밝구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左驟徒右狄得&#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왼쪽엔 驟徒여, 바른쪽엔 狄得이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寶用殿四馬作&#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뒤에는 寶用이라, 네 필 말이 떨쳐 서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進如風眼無敵&#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바람처럼 나아가니 안중에 적이 없도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凌堅陳厭&#27562;戮&#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견고한 진세 우습게 여겨 죽여 쓸어뜨리기에도 염증나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弓刀折力已&#25616;&#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활과 칼도 부러지고 힘도 이미 부치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身雖死威聲暴&#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몸은 비록 죽더라도 위엄있는 소리는 세찼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21769;將軍羅勝族&#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어허! 將軍께선 신라의 명문이었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王有女顔白玉&#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상감껜 따님 있어 그 얼굴은 백옥이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手指細饒材識&#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손가락은 가냘파도 재주와 식견 넉넉했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王憐之求匹適&#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상감이 사랑하여 마땅한 짝 구할 적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衆擧同果&#38926;碩&#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한결같이 추천을 하니 과연 헌걸차고 의젓하였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賜大家宮塢側&#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큰 집을 내리시니 궁성 곁이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臨曲池穰三尺&#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계곡 연못을 내려다보는 땅이 삼 척이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前簫笙後&#26826;簿&#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앞에는 생황 통소 뒤에는 바둑 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坐有薦臥有適&#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앉으면 돗자리요 누워도 편안했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入有譽出有督&#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들어오면 기림이요 나가면 권면이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肉有林酒有洛&#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고기는 산더미 양, 술은 강물처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凡有願無不得&#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바라기만 하면은 못 얻을 게 그 무엇인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日夜代驩樂續&#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밤낮으로 번갈아 즐거움만 이었겠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邊虞警忠義激&#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변방에 변고 나자 충의가 북받쳐서</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策馬去捐富樂&#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말을 채찍질하여 떠날 때 부귀영화 버리기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如弊衣誓死國&#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다 해진 옷차림 하고 나라에 목숨 바치기 다짐하였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從者&#35723;勸逋&#36767;&#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侍從은 두려워서 몸 사리길 권하면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君貴骨死無盡&#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당신은 귀골이니 죽을 게 무엇입니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爲不聞走死賊&#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알려지지도 않으면 달아나다 적의 손에 죽은 줄 알걸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烏&#22033;群食朽肉&#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아! 무리들에게 외쳤으니, 썩은 고기나 먹어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肉雖朽爲鬼伯&#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내 육신이야 썩더라도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37806;陽山誓報國&#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陽山을 지키면서 맹세코 나라에 報答하리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天雨陰聲&#34409;畵&#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날씨마저 음산한 데, 두려움을 드러내는 소리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百濟將有階伯&#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百濟 將帥에 계백이 있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智勇備萬夫敵&#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지혜와 용기를 겸비하여 많은 장정을 대적하였기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羅師&#36987;皆&#36767;易&#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신라 군대가 만나기만 하면 모두 쉽게 물러났건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至陽山酒敗&#34884;&#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양산에 다달아서는 기세가 꺾여 이내 패했으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神實亢溫祀剝&#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그 정신이 참으로 높았으니 지속된 제사가 끊어질 것인가?</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仄聲으로 句句押韻한 46句 276字의 이 六言詩는 ‘肉雖朽爲鬼伯 鎭陽山誓報國’하려던 金欽運의 丹衷을 읊었는데 ‘神實亢溫祀剝’에서 신라의 운명이 꺾일 것인가? 金欽運의 정신이 굳세었으므로 튼튼하다고 보고 있는&#160;것이다.</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_________________________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4">* &#38440;-막힐 액, 길 험할 애, &#26935;-잔 감, 담을 함(&#15232;(함)과 동자同字, 劒-칼 검, 劍(속자), &#37003;-나부낄 랍(납), 癲-미칠 전, &#30248;(전)과 동자同字, 毆-때릴 구, 때릴 우, 霆-천둥소리 정, 雹-우박 박/ 두들길 박, &#25890;-모일 찬, &#37433;-쇠꼬챙이 피, &#25123;-양지창 규, &#25709;-주울 척, &#25757;-찢을 휘, 도울 위, &#30687;-창 삭, 晳-밝을 석, 驟-달릴 취, &#27562;-쓰러질 에, 쓰러질 예, 戮-죽일 륙(육), &#25616;-당길 휵, 경련할 축, &#38926;-헌걸찰 기, 작을 간, 碩-클 석, 塢-둑 오, 穰-줄기 양, 잘게 썬 짚 영, &#26826;-바둑 기, 簿-문서 부, 잠박 박/ 얇을 박, 薦-천거할 천, 꽂을 진, 驩-기뻐할 환/ 말 이름 환, 策-꾀 책/ 채찍 책, 捐-버릴 연, &#35723;-두려워할 섭/ 자꾸 지껄일 섭, 逋-도망갈포, &#36767;-피할 피, 임금 벽, 비유할 비, 그칠 미, &#22033;-부르짖을 호, 伯-맏 백, 우두머리 패, 길 맥, &#34409;-두려워하는 모양 혁, 범 놀랄 색, &#36987;-만날 악, 저촉될 오, &#34884;-코피 뉵(육), 祀-제사 사, 剝-벗길 박</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信齋의&#160;陽山歌의&#160;序는&#160;원교&#160;것과&#160;꼭&#160;같으며,&#160;시는&#160;다음과&#160;같다.</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入有&#24789;兮出無地&#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들어가면 시름 있어라, 나올 길 없는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君何爲兮陽山下&#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그댄 어쩌자고 양산기슭에 진을 쳤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金門兮玉堂&#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궁전 문이여 궁궐이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思君兮不可舍&#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임금님 생각이여 버릴 길 없었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宮中人兮婉娩&#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나랏님의 딸이여 곱고 고와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御夫子兮無&#24548;&#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남편을 맞이함에는 거스림이 없었다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美酒兮嘉&#27581;&#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아름다운 술이여 좋은 안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鍾鼓比兮該具&#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종소리 북소리 마땅히 갖추었다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君王兮愛之極&#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상감께선 가장 사랑하시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耳目兮以爲嬉&#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귀와 눈을 음악으로 즐기어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樂康兮不愆&#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즐겁고 편안한들 허물이 없나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君何爲兮異思&#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그댄 왜 다른 생각 품는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上有天兮下有地&#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으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忠與義兮我知之&#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충성과 의리를 내 알거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知我者有兮天與地&#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날 알아 줄 이는 하늘과 땅이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雖天地不知兮吾何疑&#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아무렴 천지가 모른다 해도 내 무엇을 의심하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25757;長劍兮縱短&#36705;&#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긴 칼을 휘두르고 짧은 고삐는 놓아주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日瘀&#37984;兮風震靡&#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해도 병들어 삭아들고 바람도 우레에 사라지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神隍隍兮山之阿&#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精神도 어수선했네 양산의 언덕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驟徒狄得與寶用兮又何爲驟徒와&#160;狄得이와&#160;寶用이여!&#160;무슨&#160;까닭인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彼大鬼兮尙受恩多時&#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저 큰 넋이여! 아직도 많은 은혜 입거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爾小鬼兮汝又奇&#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그대들 작은 넋이여! 그대들 또한 奇特하여라</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信齋 역시 ‘天地不知兮吾何疑’에서 자기만이 아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金歆運이 목숨 바침을 귀히 여겼고, ‘爾小鬼兮汝又奇’에서 따라 죽은 세 넋을&#160;또한&#160;기리고&#160;있다.</span></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____________________________</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4">* &#24789;-두려워할 척, 舍-집 사/ 버릴 사, 벌여놓을 석, 婉-순할 완/ 아름다울 완, 순할 원, &#24548;-거스를 오, &#27581;-섞일 효, &#25757;-찢을 휘, 도울 위, &#36705;-고삐 비, 瘀-어혈질&#160;어,&#160;&#37984;-녹일&#160;삭,&#160;지질&#160;약,&#160;靡-쓰러질&#160;미,&#160;갈&#160;마,&#160;隍-해자&#160;황</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1.&#160;파경합破鏡合</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栗里의 薛氏 아버지는 늙었는데도 北狄의 침로를 當하여 防衛에 나서게 되자, 그 딸은 제 몸으로 代身하지 못함을 恨스럽게 여겼다. 少年 嘉實이 代身 가겠노라 나서므로 그 아버지는 돌아오면 그 딸을 시집보내기로 하였다. 거울을 쪼개어 信標를 삼아, 한쪽을 남긴 채 말 한 마리를 두고 떠난 뒤 6년이 되어도 돌아오질 않았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3年으로 期限을 삼았으므로 다른 데로 시집가도 된다고 하였으나 薛氏女가 굳이 拒絶하며, 날마다 마구에 가서는 말만 보아도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嘉實이 돌아왔으나 몸이 마르고 여위어 알아 볼 수가 없었다. 嘉實이 깨어진&#160;거울을&#160;보이자&#160;아버지는&#160;마침내&#160;그&#160;딸을&#160;주었다.</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栗里薛氏父老&#160;當防狄&#160;女恨不身代.&#160;少年嘉實願代&#160;父許以女待歸嫁之.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分鏡爲信留一馬&#160;行六年未還.&#160;父&#160;曰始以三年&#28858;期&#160;可歸他族&#160;薛固拒之&#160;日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至&#24271;見馬&#160;流涕.&#160;及嘉實歸&#160;形骸枯&#30209;&#160;不可知.&#160;嘉實示破鏡&#160;父遂歸其女</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160;</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南流洛東東&#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南으로 흐르는 洛東江 東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少婦迎新郞&#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새색시 新郞을 맞았다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月色上窓&#27386;&#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달빛은 창살에 비치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37913;華爽幽房&#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등잔불이 밝은 아늑한 방에 날이 밝으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左右掛半鏡&#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양쪽에 반쪽 난 거울을 거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闇然自生光&#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희미하나 명백히 빛이 절로 생기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新婦對新郞&#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새색씨 신랑을 마주보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細細言語詳&#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소근소근 그 말씨 자상도해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奈何新&#25085;初&#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어이해 첫 기쁨 속에 어이해 첫 기쁨의 시작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一言三歎長&#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한마디 하고는 긴 한숨 세 번인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傾耳聽其言&#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귀 기울여 그 말 들으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可樂復可傷&#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즐거우나 다시 또 근심스러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吾聞古女子&#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듣자니 옛날 색시들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勝似丈夫强&#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장부의 강함보다 더해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幼少替父征&#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어려서도 아비 대신 出征하여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樹勳歸故&#37129;&#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功을 세우고 고향엘 돌아왔다던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兒生苦脆薄&#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아이는 날 때부터 너무도 弱質이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一身勝衣裳&#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몸이라야 옷을 겨우 가누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兩臂適任匙&#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두 팔이라야 겨우 수저를 가눌 지경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兩脚勞下堂&#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두 다린 대청 내려가기도 힘들어하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可論荷刀戟&#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칼이며 창을 메는 것은 논할 만해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千里超敵場&#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千里라 敵地에 뛰어 넘을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王國多外虞&#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우리나란 外憂 잦아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選卒守邊疆&#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軍卒 가려 國境을 지키게 하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十五之六十&#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열다섯에서 예순까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盡起備戎行&#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모조리 나서서 군대 갈 준비하는 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兒父衰病至&#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애 아빈 너무도 늙고 병들었건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無計漏大綱&#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요강을 벗어날 길이 없었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命途何畸隻&#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운명은 어이 이리 얄궂은가</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眼中無兒郞&#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눈앞엔 아들마저 없다니 원!</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女如夢裡物&#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딸이란 꿈속 것과도 같아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生涯劇悲凉&#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이 一生 너무도 슬프고 처량하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兒聞心爲帥&#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이 말 듣고 저는 장수가 될 양으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心壯氣骨剛&#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마음은 씩씩하고 氣骨은 억세인양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誓心欲作健&#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맹세코 건장해지길 바라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24572;慨試&#21082;&#25654;&#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강개하고 분노해서 칼로 꽂고 부딪쳐도 보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擧杵學奮擊&#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절구공이를 들고 휘두르고 공격하는 것을 익히자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堅重不可當&#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그 무겔 감당할 수나 있어야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投棄却自頹&#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다 집어 치우고 그만 절로 주저앉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抱父&#25703;心腸&#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아비를 얼싸안고 가슴만 무너졌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邨隣有少年&#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한 마을 이웃에 少年이 있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自願替父將&#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선선히 아비 대신 나가겠다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微誠&#35406;感激&#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작은 정성이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高義陵穹蒼&#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높은 의리는 푸른 하늘에 닿는구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貧家有女兒&#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가난한 집에 딸 하나 있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所學祗有孃&#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배운 거란 오직 제 어미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鄙陋無所習&#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촌스러워 익힌 것 없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見識唯蠶桑&#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아는 것은 오직 누에치기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容姿未逾人&#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용모라야 남보다 낫진 못하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性度足端莊&#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타고난 성품은 단정하고 장엄하다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老夫感君義&#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이 늙은 게 그대 義理에 감격되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無物可報償&#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그 은혜 갚을 게 없구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望君成功還&#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바라건데 功을 이루고 돌아오거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待年於閨房&#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閨房에서 몇 해 기다리게 할 터이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君行須期發&#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그대는 제 날에 떠나 주기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勿復念齋裝&#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가져갈 旅裝일랑 걱정 말게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弱女已自治&#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어린 딸이 이미 손수 마련했다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戈甲與&#29492;&#31931;&#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창이며 甲옷에 마른 식량까지(&#39217;糧이 아닐까? 마른식량,&#160;&#29492;&#160;원숭이,&#160;후&#160;&#39217;&#160;건량&#160;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少年再拜告&#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少年이 再拜하고 아뢰기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敎言多感惶&#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그 말씀 너무도 고맙고 황공합니다</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今行賴王靈&#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이번 길에 염라대왕 힘을 입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不死還&#25949;庄&#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죽지 않고 제 집에 돌아온다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誓天地鬼神&#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하늘과 땅의 귀신 두고 맹세하오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秉義不相忘&#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義를 지켜 잊지 아니하오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我有藤原鏡&#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제게 藤原거울이 있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背書雙鳳凰&#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뒤에는 봉황 한 쌍 그려 있으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生死宜有信&#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죽건 살건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하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分之各收藏&#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쪼개어 각각 간직하오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又有絶影馬&#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제게 또한 봉래산의 말이 있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行地性馴良&#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그 땅으로 가는 데 길이 잘들어 순하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步兵無所乘&#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步兵은 탈 필요 없기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爲解紫絲&#38849;&#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붉은 실 고삐 풀어 드리리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33289;手更丁寧&#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손을 들어 다시금 정중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裝束告分張&#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떠날 차비 갖추고 이별 告하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矢繕肅&#24910;&#26971;&#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肅愼의 광대싸리 화살을 손을 보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劍帶大板&#37609;&#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검 때로는 큰 나무판을 칼끝에 껴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軒然出門去&#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훤출하게 문을 나서서 가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身材何堂堂&#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체겨은 어찌 그리 堂堂하던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將軍整隊伍&#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將軍이 隊伍를 정돈하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命總前司槍&#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앞에서 거느려 槍 맡으라 命했다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吉日排陳出&#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좋은 날에 줄 지어 出陣을 하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兩兩如鴛鴦&#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둘씩 둘씩 원앙새 같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朔風&#39085;牙&#26050;&#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北風에 大將旗 번득이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曉穿鳥嶺霜&#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새벽에 조령 새재의 서릴 뚫고 갔다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朱蒙事侵掠&#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朱蒙은 침략과 약탈을 일삼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屯兵守漢陽&#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군사를 머물러 漢陽을 지켰기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蹴泥&#25182;交河&#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진흙을 걷어차며 交河에서 막았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衝雪戰平康&#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눈과 뒤엉켜 平康에서 싸웠다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兒年漸婉娩&#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딸아이는 갈수록 더 아름다와져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守節宿孤床&#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節操 지켜 외로이 지냈더라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歸期奄差池&#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돌아올 기약은 착오가 난지 오래더니</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愁見荳&#34107;香&#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荳&#34107;같은 少女얼굴에 시름이 생겨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朝朝撫鏡歎&#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아침마다 거울 문지르며 한숨짓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暮暮對馬傷&#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저녁마다 말을 보며 가슴 아팠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又聞百濟入&#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百濟가 쳐들어와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移麾出帶方&#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大將旗 帶方으로 옮기어 갔다고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窓外歲種瓜&#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창밖엔 해마다 박을 심어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六見實瓣&#29924;&#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여섯 번 열매 맺어 박속을 내었다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父翁向兒言&#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아버지가 딸애에게 하는 말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我老無兒郞&#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이 애빈 늙었는데 아들이 없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眼中祗有汝&#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있는 건 오직 너 하나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寶愛如珪璋&#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아끼고 사랑하길 珪璋(옥으로 만든 구슬)인양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浮生若風燈&#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덧없는 인생이라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인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老人安得常&#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늙은이가 어찌 한결같겠느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老人心情弱&#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늙은인 마음에 품은 생각과 감정이 약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來日不可量&#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來日을 어찌 헤아리리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心中無&#23427;事&#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마음엔 딴 걱정 없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只望汝湍長&#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단지&#160;바라느니&#160;네가&#160;어서&#160;자라서</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得壻如得子&#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사위 보면 아들 둔 듯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生死永賴&#24171;&#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죽건 살건 길이 의지하렸더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雖與少年約&#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少年과 비록 言約은 같이 하였으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存沒何渺茫&#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生死조차 어이 이리 아득한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巷南昔長者&#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골목 南녁에 예전 長子 있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系譜出璿潢&#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따지자면 왕족이란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家有第三子&#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그 집에 셋째 아들이 있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早已學詩章&#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일찌감치 詩文을 배웠다더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武力&#39047;有之&#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힘도 제법 있어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能挽五石彊&#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닷 섬은 능히 끌 만큼 굳세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人物出凡常&#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人物도 凡常치 않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家計又&#35920;穰&#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살림도 넉넉하단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籬外上稻田&#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울 밖엔 벼를 올릴 논이 있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十里連&#22605;강(田亢)&#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十里나 밭두둑이 계속 이었다</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老婆甚和便&#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할멈도 몹시 온화하고 순하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30495;可爲姑&#23260;&#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참으로 시부모 삼을 만하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年巳十八九&#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나이 벌써 열여덟인지 아홉이라는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簡斥不迎娘&#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고르느라 며느린 안 맞았댄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於何聞汝賢&#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어디서 너 어질단 소문 들었는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昨來願結芳&#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어제 와서 좋은 인연 맺자는구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一言便卽諾&#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한마디에 바로 承諾했으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吾心久欽昻&#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내 마음에 오래 우러러 사모했느니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吉事貴在速&#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좋은 일은 서두름이 으뜸이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日月近擇良&#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쉬이 좋은 날을 가리잤구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昔老大歡樂&#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처음에 영감은 신바람 나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應答如&#27846;湯&#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댓구가 끓어 넘치듯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汝宜製裳衣&#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아가 옷도 지어야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在心理容&#22941;&#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마음으로 매무새도 가다듬기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兩&#33134;下珠淚&#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두 볼엔 구슬같은 눈물 흘리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怒氣上&#28165;揚&#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怒氣는 아름답게 올랐어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翁年未&#32779;&#32772;&#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아버진 아직 七旬 八旬으로 정신이 혼미할 때 도 아니신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言辭何妄荒&#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말씀이 어이 이리 망령되세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少年去時言&#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少年이 떠날 때 말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豈伊至相忘&#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어찌 이리 잊으셨나이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與人先結約&#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남과 언약 미리 해 놓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背之甚不祥&#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어김은 너무도 상서롭지 못합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翁言兒見誤&#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아버지 말씀, 아가 네 생각이 잘못인 것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吾已&#31597;之詳&#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내 벌써 곰곰이 생각했느니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少年去時言&#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少年이 떠날 때 말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三年當還鄕&#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三年이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고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今已兩三年&#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이제 벌써 三年이 두 번인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不聞存與亡&#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生死조차 소식 없으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老&#20630;負少年&#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이 늙은 놈이 少年을 저버렸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少年負老&#20630;&#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少年이 늙은일 저버린 거냐</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他日雖歸來&#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훗날 아무리 돌아온단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無言脫吻&#21549;&#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할 말은 없으리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兒口可閉藏&#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언년이는 입을 닥쳐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少女起復坐&#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少女는 일어났다 다시 앉으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擧止不遑忙&#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擧動도 차분하게 여쭙기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其人爲誰&#36811;<span style="color: #ee2323; background-color: #ffffff;">5</span>)&#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갔더이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豈不代老&#20630;&#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아버지를 대신한 게 아니더이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人遲卽翁遲&#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그 사람이 더디 옴도 아버지 때문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人亡卽翁亡&#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그 사람이 죽는 것도 아버지 때문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翁遲與翁亡&#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아버지 때문에 더디 오거나 죽는다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可見女迎郞&#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어떻게 사월 맞을 수 있겠어요</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均之不可見&#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못보기는 마찬가지라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守信寧不臧&#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信義지킴 차라리 착하지 않겠어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人能代我死&#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남은 나 대신 能히 죽기도 하는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我忍負要盟&#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내 차마 맹세를 저바리리오</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_________________________</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style="color: #ee2323;">5</span>)&#160;령은&#160;왕(&#36811;=往)의&#160;誤寫인&#160;듯,&#160;&#36811;자도&#160;갈&#160;왕자로&#160;사용하는&#160;경우도&#160;있음</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人不有信義&#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사람이면서 信義 없다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何以別猪羊&#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莫說兩三歲&#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三年이 두 번이라 말씀 마세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兒心比孤孀&#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제 마음은 외로운 과부와도 같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百年且可待&#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百年이라도 앞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遲速可較量&#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더디고 빠름만 따질 것인가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馬何在我&#27370;&#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말은 왜 우리집 마판에 있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鏡何在我箱&#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거울은 왜 제 상자에 있지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欲我嫁他人&#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저를 다른 데 시집보내시려거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訪我於北邙&#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北邙山에나 가서 절 찾으세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老翁大驚遑&#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늙은 영감 놀라고 당황하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任汝自在由&#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오냐 오냐, 네 마음 내키는 대로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老父敢主張&#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이 애비가 敢히 우길까보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入室復開鏡&#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房에 들어 다시금 거울을 꺼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撫摩涕滂滂&#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쓰다듬고 매만지니 눈물만 뚝뚝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擧身就&#30337;棧&#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일어나 마판에 나아가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馬鳴如相迎&#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반기듯 말이 우누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刷&#39715;復益芻&#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갈기를 쓸어 주고 꼴을 더 주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32107;且&#20223;&#27447;徨&#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거듭하여 또 한숨지어 거닐며 헤매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汝惟知苦心&#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너만이 쓰린 이 맘 알아주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汝惟見淚&#30518;&#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너만이 눈물진 눈망울을 보는구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對立&#24876;心事&#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마주서서 심사를 하소연하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日日以爲常&#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날이면 날마다 이것이 日課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一日朝開鏡&#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하루아침 거울 꺼내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光輝若新&#37770;&#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그 빛이 마치 갓 깎은 듯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下&#22566;視其馬&#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섬돌을 내려서 말을 보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36521;蹄欲飛揚&#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뛰려는 발굽이 날아오를 듯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中心不知解&#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속마음 웬일인가 알 길 없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延頸勞遠望&#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목을 늘여 한껏 바라보았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老翁過隣來&#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영감이 이웃을 지나오면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喜劇欲&#39003;&#20725;&#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너무나 기뻐서 엎으러질 지경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昨日邊軍還&#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어제 邊方軍士 돌아오는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少年居前行&#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少年이 맨 앞장 섰더라는구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聞說功最大&#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듣자니 功이 가장 커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將拜羽林郞&#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앞으로 羽林郞 벼슬을 받을 것이라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其後未數日&#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며칠이 안 되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嘉實來拜堂&#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嘉實이 돌아와 堂前에 절을 하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身幹旣壯大&#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키는 벌써 훌쩍 컸건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38991;貌且&#30224;&#23594;&#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얼굴은 여위고 다리를 저는 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少年&#22079;無語&#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少年은 말문 막혀 말도 못하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菱花出自囊&#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머니속 菱花鏡만 불쑥 내밀 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遂持兩鏡合&#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마침내 두 거울 한데 合하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圓徑正相當&#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둘레며 지름이 꼭 맞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中間悲喜事&#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그 동안의 슬프고 기쁜 일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35446;答萬千强&#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고받은 말들은 千萬言 넘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急選黃道日&#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서둘러 陰陽의 吉日을 가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開宴行醮觴&#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잔치 벌여 醮禮를 지내니</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村家無盛&#39193;&#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시골이라 요란한 꾸밈 없어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亦能具簪&#29867;&#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그런대로 비녀며 귀걸인 마련하였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新婦迎新郞&#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새색씨 새신랑 맞을 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23277;態適短長&#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아리따운 맵씨에 키도 알맞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不謂野農家&#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農家라고 촌스럽다 이르지 마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生育杜蘭香&#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모란의 향기 속에 나서 자랐다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觀者傾四隣&#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보는 이 온 이웃이 감탄하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嗟歎舌久綱&#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감탄하여 오래도록 혀를 든 채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女節固無對&#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색씨의 節槪야 실로 짝 없거니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37070;義甚奇彰&#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신랑의 義理도 너무나 매우 뚜렷해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空閨斷音信&#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외로운 閨房엔 소식조차 끊겼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絶傲事斧&#26024;&#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외진 要塞에선 다루느니 武器러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誰意一牀燭&#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뉘라서 뜻했으랴 한 자리의 촛불 아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歡娛殊未央&#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기쁘고 즐겁기 자못 끝없을 줄을!</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總114韻 1140字의 五言의 長詩에는 어린 新郞 嘉實의 義氣와 어린 薛氏女의&#160;굳은&#160;節介가&#160;조선魂의&#160;한&#160;모습으로&#160;그려져&#160;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망녕기 난 듯한 늙은 아버지의 흔들림도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니, 실은 薛氏女의 강매운 節介를 돋보이기 위한 背景이라고 할 만하다. 더구나&#160;세&#160;사람의&#160;眞率한&#160;이야기들을&#160;구성지게&#160;잘&#160;그려내고&#160;있음에야.</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툭 트이고 밝은 陽韻을 가려 換韻없이 내리 달리고 있는데, 이 中에는 陽韻 114韻 外에 똑 같은 陽韻은 아니지만 共鳴度가 큰 [&#7505;]음을 지닌 글자들이 東·東(雙聲·疊韻) 迎·上窓(疊韻)·鏡·爽·房(句中押韻)·鏡·生·郞·傾·聽·勝·丈·征·生·勝·兩·兩·王·戎·病·命·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中·夢中(疊韻)·生·壯·重·誠·陵穹·容·性·望·功·行·行·王 靈·秉·相望(疊韻)·藤·鏡·雙鳳·生·影·行·性·兵·乘·更·丁寧(疊韻)·裝·堂堂(雙聲·疊韻)·將·整·命·總·兩兩(雙聲·疊韻)·風·嶺·夢·兵·衝·鏡·窓·種·翁·向·郞·中·生·風燈·情·中·望·生·永·巷·長·能·常·上·勝·迎·應·裳·容·兩·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淸·翁·妄荒(疊韻)·相忘(疊韻)·翁·當·兩·&#20630;·遑忙(疊韻)·&#20630;·翁·亡·亡(句中押韻)·翁·翁·迎郞·寧·藏·能·盟·羊·兩·孀·量·鏡·箱·訪·邙·翁·驚·鏡·滂滂(雙聲·疊韻)·鳴·相·彷徨(疊韻)·鏡·光·中·頸·翁·功·將·壯·菱·兩·鏡·徑·正·相當(疊韻)·中·黃·行·盛·迎·郞·農·生·傾·郞·空·牀 등의 글자가&#160;160字나&#160;들어&#160;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그들의 言約만 한 뒤 헤어져 그린 六年의 세월은 기다림과 눈물의 세월이었지만, 맨 첫머리가 花燭洞房으로 시작되고, 끝 또한 歡娛殊未央으로 끝나는 기쁨에 감싸인 내용이기 때문에 밝고 확 트인 陽韻은 실로 잘 가려진&#160;韻字다.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앞서 보았듯이 게다가 160字나 되는 共鳴度 높은 [&#7505;]음의 글자가 또한 그 기쁨을 돋궈주고 그 中에는 東東·細細·堂堂·兩兩·滂滂·朝朝·暮暮·日日 등의 雙聲疊韻이 그 때 그 때 분위기를 더욱 强調해 주고, *(上窓)·夢中·相忘·丁寧 *(妄荒)·相忘·遑忙 *(&#20223;徨)·相當 등의 疊韻 역시 韻의 겹침으로 情感의 겹침을 강조해 주고 있다.(*괄호안의 글자는 우리 발음으로는 같은 중성과, 종성으로 운을 가지고 있으나,&#160;한자의&#160;성조로는&#160;운은&#160;되지&#160;않는다.)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그리고 *(爽)·方·亡·亡의 句中押韻이며, ‘新婦對新郞 細細言語詳’ 朗과 詳은 특히 句句押韻으로 긴 세월 못다 한 말문이, 細라는 齒音의 연속으로 薛氏女의 소근거림의 효과를 돋보이고 있다. 그러고도 詳을 다시 덧붙였으니 韻字이거니와 역시 聲이 齒音이라 細細와 함께 석자의 연이은 음이 역시 가늘고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근거림의 表現으로 妥當한 效果를 내고 있다. *(爽)자는 압운이 아니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內容面에서는 우선 그들의 만남의 기쁨을 月色·&#37913;華·鏡光의 세 가지 빛을 閨房에 비치고 있는 것이다. 소근대는 새색씨의 말을 적고는, ‘奈何新&#25085;初&#160;一言三歎長’으로&#160;그&#160;緣由를&#160;끄집어내기&#160;시작하고&#160;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吾聞古女子 勝似丈夫&#24375; 幼少替贊父征 樹勳歸故鄕”이라 부러워하면서, 自己의 現實(육년 전의 과거)을 “兒生苦脆薄 一身勝衣裳 兩臂適任匙 兩脚勞下堂” 으로 딸의 弱骨임을 具體化하고 있다. 그러니 “可論荷刀戟千里趨敵場”이&#160;나오게&#160;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그 當時 國家의 形便을 15세에서 60세까지 男子면 다 國防에 임해야 했으므로 늙고 골골하는 이 薛氏 또한 그 義務에서 예외일 수 없었기에 영감은 자탄한다. “命途何畸隻 眼中無兒&#37070; 女如夢中物 生涯劇悲凉” 이라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아들이 없으면 사위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女如夢中物’이니, 딸아이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쓸모없어 아비신세는 悽凉키만 한 것이다. 늙은 아비의 이 넉두리를 듣고는, 마음만은 孝心 있어 절구공이로라도 奮擊을 익히려 하나, 실은 공이조차 가누지 못하는 薛氏女는 마침내 주저앉아 아비를&#160;얼싸안곤&#160;가슴만&#160;무너진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이때 나타난 이웃 少年 嘉實에게 아비는 ‘貧家有女兒’라 하며 돌아오면 주겠다고 言約한다. “所學祗有孃 鄙陋無所習 見識唯蠶桑 容資未逾人性度足端莊”이라 하여, 아는 것은 길쌈뿐이고 생김새라야 남보다 낫지도 않은, 그러나 타고난 마음씨만은 端莊하다는 과장 없는 아비의 말이 역시 實답기 짝이 없다. 아비의 말은 ‘君行須期發 勿復念齋裝 弱女已自治 戈甲與&#31943;&#31931;’이라&#160;맺고&#160;있다.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嘉實의 말은 “敎言多感惶”에서 “步兵無所乘 爲解紫絲&#38849;”으로 맺어진다. 信物로는 藤原鏡을, 반쪽씩 쪼개 가지고 絶影馬를 영감에게 두고 가는 것이고 ‘擧手更丁寧’ 으로부터 ‘衝雪戰平康’ 까지는 出征으로부터 애쓰는 嘉實의 모습을 그렸다. ‘兒年漸婉娩∽窓外歲種瓜 六見實瓣瓢’에 그녀의 기다림이 그려져 있다. 특히 ‘朝朝撫鏡歎 暮暮對馬傷’에 嘉實을 보듯 매만지는 거울이며, 그를 보듯 어루만지는 말에 대한 愛情이 그에 대한&#160;그리움을&#160;서려&#160;놓고&#160;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我老無兒郞’에서 시작되는 늙은 아비의 前奏는 ‘寶愛如珪璋’으로 딸에 대한 사랑을, 自身은 風燈에 비겨 “來日不可量”이라 하면서 ‘雖與少年約 存沒何渺茫’ 에서 다른 사윗감을 고르게 되는 理由로 들고있다. ‘系譜出璿潢·早已學詩章·能挽五石彊·人物出凡常’으로 郞才의 出身과 人物을 들고, ‘籬外上稻田 十里連勝’이라 그 집안의 가멸음을 들었고, 게다가 ‘老婆甚和便’&#160;에서&#160;시어미감을&#160;순하다고&#160;법석친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이런 條件으로 限껏 가린다는 집에서 네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昨來願結芳 一言便卽諾’ 하고 말았다는 아비. 더구나 한술 더 떠 ‘吉事貴在速’이라면서&#160;擇日까지&#160;걱정하고&#160;‘汝宜製裳衣&#160;在心理容&#22941;’&#160;하라에&#160;이른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비록 어리지만 곧은 딸의 마음을 얼마나 刺戟하였던지 ‘兩&#33134;下珠淚 怒氣上淸揚’에 드러난다. 딸의 푸념이 터진다. ‘翁年未&#32779;&#32772; 言辭何妄荒∽ 與人先結約 背之甚不祥’ 그러다가는 벌 받는다는 뜻이 담겨지자 ‘翁言兒見誤 吾已&#31597;之詳∽他日雖歸來 無言脫吻&#21549;’이리라 따지고는 ‘兒口可閉藏’&#160;이라고&#160;입을&#160;닥치라&#160;한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이때 딸이 일어섰다 되앉는 行動이 輕妄치 않다. ‘少女起復坐 &#33289;止不遑忙’에 反攻의 態勢가 만만치 않음을 豫示한다. 차분히 앉아서 따지자는 것이다. 慌忙해선 안되겠기 때문이다. ‘其人爲誰往’에서 차분히 시작 되는 攻勢는 ‘欲我嫁他人 訪我於北邙’에서 大團圓에 이른다. 딸의 自殺의 意志를 들은 영감은 ‘任汝自在由 老父敢主張’에 매듭지어진다. 죽는다는&#160;말만&#160;말라는&#160;아비의&#160;사랑이&#160;드러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이런 폭풍우 뒤에 ‘入室復開鏡 撫摩涕滂滂’이 이어진다. 거울을 매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는, 마구에 가서 말갈기를 빗기며 꼴을 주며 거듭 한숨지고는 ‘&#32107;&#27447;且&#20223;徨’에 그녀의 마음의 설레임이 구비친다. ‘汝惟知苦心 汝惟見淚&#30518;’에 그녀의 알뜰한 매무새가 드러난다. ‘對立&#24876;心事日日以爲常’으로&#160;段落지어진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마지막 段落은 ‘一日朝開鏡 光輝若新&#37770; 下&#22566;增視其馬 &#36521;蹄欲飛揚’ 이 앞으로 展開될 기쁨의 豫示로 등장된다. 이윽고 그 아버지가 ‘昨日 邊軍還&#160;少年居前行&#160;聞說功最大&#160;將拜羽林郞’이라는&#160;소문을&#160;딸에게&#160;傳한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六年의 出征이라는 通過儀禮 끝에 그들은 만나게 된다. ‘少年 &#22079;無語 菱 花出自囊 遂持兩鏡合 圓徑正相當’에서 사실은 이 詩는 절정에 이른다. 그 뒤에 날을 가려 혼인잔치를 지낼 때의 여러 모습들 은 차라리 군더더기다.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맨 끝의 ‘誰意一牀燭 歡娛殊未央’라는 筆者의 말이거니와, 豆滿江 南쪽 北斗星 남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또한 지레 自決하여 못다한 아내 柳氏부인과의 애&#45810;은 사랑 역시 저 세상에서는 歡娛殊未央 일 것을 그려&#160;보기도&#160;한&#160;것이나&#160;아닌가&#160;싶기도&#160;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이렇게도 간절하고 또한 曲盡한 員嶠의 詩와는 달리 信齋의 詩는 다음과&#160;같다.&#160;序는&#160;員嶠&#160;것과&#160;같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荷弓帶腰箭&#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활을 메고 허리엔 화살을 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貿貿誰家子&#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멍청한 저 총각 뉘집 아들인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自言從軍去&#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제 말로 出征하여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六年向鄕里&#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六年만에 고향에 돌아왔다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請問&#37129;里事&#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이 고장 일을 알고 싶은데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東家舊薛氏&#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東쪽집 薛氏네는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東家大都安&#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東쪽집은 다들 편안하지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老翁老不死&#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늙은 영감 늙었으나 아직 살았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有鏡&#34230;半影&#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거울은 半쪽이 묻혀 있으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有馬臼其齒&#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말은 어금니로 여물을 씹지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獨有少女郞&#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다만 딸 하나 있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有節秋霜似&#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秋霜같은 節介를 가졌답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秋霜待陽春&#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秋霜의 매서움도 따뜻한 봄을 기다릴 때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到頭光輝美&#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온통 빛나고 아름다우리</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素朴한 이 五言 98字의 詩 中에 貿貿라는 雙聲疊韻이 있고, 東家가 두 번, 秋霜이 역시 되풀이 되니, 嘉實이 궁금한 게 東家의 일이라 되풀이 되었거니와 薛氏女의 節介 역시 秋霜이기 그것의 강조를 위해 역시 되풀이된 것이다. 특히 有鏡∽有馬며, 獨有, 有節이라든지 老翁老 등에 信物로 주고 간 거울과, 두고 간 말이 嘉實의 image로 부각되어 있고, ‘老翁老不死’에 늙은 영감 늙었는데도 죽지 않고 있다는 말 역시 그 동네의&#160;不變함을&#160;강조하고&#160;있는&#160;터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_________________________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4">* &#27386;-격자창 령(영), 脆-연할 취, 匙-숟가락 시, 戎行-군대, 命途-운명, 畸-뙈기밭 기/ 불구 기, &#21082;-칼 꽂을 사, &#25654;-부딪칠 창, &#25703;-꺾을 최, 꼴 좌, 鄙-더러울비/ 마을 비, 弱女-어린 딸, 王靈-염라대왕의 넋, &#25949;-해질 폐, 절뚝거릴 별, 馴良-길이 잘 들어 순함, &#38849;-고삐 강, &#26971;子-광대싸리, &#39085;-물결 일 점, &#25182;-막을 한, 펼 간, &#34107;-육두 구, &#29924;-박속 양, 祗-공경할지, &#23427;-다를 타, 뱀 사, 湍-여울 단, 강 이름 전, 渺茫-묘망 넓고 멀어서 바라보기에 아득함, 璿潢-선황, 璿源-선원 왕실의 조상에서 갈려 내려오는 겨레붙이의 계통(璿潢, 璇源), 詩章-시詩의 장章과 구句, &#39047;-자못 파, 挽-당길 만, 穰-줄기 양, 잘게 썬 짚 영, &#22605;-밭두둑 승, 밭두둑 증, &#27846;-음탕할 일, &#32779;-늙은이 질, &#32772;-늙은이 모, &#31597;-산가지 산, &#20630;-천할 창, 老&#20263;-늙은 놈, 吻-입술 문, 閉藏-드러나지 않게 감추어라, 臧-착할 장/오장 장, &#27370;-말구유 력(역), 涕-눈물 체, 滂-비 퍼부을 방, 물결 부딪치는 소리 팽, &#30337;-하인 조, &#39715;-갈기 렵(엽), &#32107;-묶을 루(누), &#20223;-본뜰 방/ 헤맬 방, &#30518;-눈자위 광, &#24876;-하소연할 소, 두려워할 색, &#36521;-바삐 갈 확, 蹄-굽 제, &#39003;-엎드러질 전/ 이마 전, &#20725;-넘어질 강, &#30224;-병들 유, &#23594;-절름발이 왕, 綱-벼리 강, &#26024;-도끼 장, 貿貿(&#30592;&#30592;)- 교양敎養이 없어 말과 행동行動이 서투르고 무식無識함, &#34230;-메울&#160;매,&#160;到頭-정점에&#160;이르다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2.&#160;조촉사朝蜀使</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唐明皇이 蜀땅으로 避難함에 新羅의 景德王이 使臣을 보내어 水路로 成都에&#160;이르게&#160;하니,&#160;明皇이&#160;손수&#160;十韻詩를&#160;짓고&#160;편지를&#160;王에게&#160;주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唐明皇播蜀 新羅景德王遣使 水路 至成都 帝親製十韻詩 手札賜王</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萬國歸聖唐&#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온 天下가 거룩한 唐에 歸服하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覆載均天地&#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하늘이 만물을 고르게 덮고 땅이 만물을 고르게 받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僻陋處海隅&#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매우 누추하고 궁벽한 두메구석에서 바다 모퉁이를 다스려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蚤聞事大義&#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일찍이 큰 나라 섬기는 義는 들었답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舟車虔享儀&#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배와 수레로 공손히 선물을 드립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土物玉帛備&#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土産과 玉과 비단 비단을 준비했습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隣邦矜狼戾&#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이웃나라가 사납고 거셈을 뽐내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梗路閑誠志&#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길을 막고 정성된 뜻을 막았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大君垂憂勤&#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天子께서 근심하여 노력을 베푸심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命將鋤梟&#40409;&#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장수들에게 명하여 사나운 것을 목매달아 없애라 명 하셨으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蘇李古方召&#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蘇定方, 李績은 옛날 주대의 방숙方叔과 소호召虎이니<span style="color: #ef5369;">6</span>)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백제와 고려를 멸망시킨 장수는 소정방과 이적)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濟麗盡屠&#21139;&#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百濟며 高麗를 모조리 죽이고 코 베었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普天孰非臣&#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온 天下 그 누가 臣下가 아니리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大德偏撫庇&#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大德으로 유달리 어루만지고 감싸주셨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自奉開元詔&#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開元(당현종의 연호) 詔書를 스스로 받아 본받았으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中國聖人治&#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中國은 聖人이 다스리시어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____________________</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style="color: #ef5369;">6</span>) 方召:明. 唐王時 江山縣知事 淸兵이 오자 고을의 앙화를 피하고자 우물에 투신자살함.&#160;〈明史〉&#160;276에&#160;보임.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風雨不乖淫&#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風雨는 거스르고 심하지 않았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禮與他邦異&#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禮節은 다른 나라와 달랐다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貢道阻范陽&#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朝貢길은 范陽에서 막히었으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23421;臣敢驕肆&#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孼臣(불충한 신하)이 敢히 교만하고 방자하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又聞大駕奔&#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또한 듣자니 天子가 급히 가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踰梁劍外寄&#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梁州를 지나 劒閣山 너머에 도착해 계시다기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痛泣理海舟&#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슬피 울고 배를 손질하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九驛<span style="color: #ef5369;">7</span>)達一使&#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아홉 번 통역 바꿀 먼 땅에 使臣 하나 보냅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天王在荊棘&#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천자가 荊棘(어려움)에 계시거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路難可遑議&#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行路의 어려움 의론할 겨를 있사오리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積年乃得還&#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여러 해 만에야 돌아오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十去存一二&#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열이 가야 살아온 이 한둘이옵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手札兼宸章&#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손수 쓴 편지에 글까지 주시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燦爛天上墜&#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天上에서 떨어진 듯 찬란하여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顧此九夷醜&#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생각컨대 이 未開한 오랑캐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安得雲漢字&#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어찌 천상의 글씨를 얻겠습니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所恨單弱甚&#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다만 한스럽기는 너무도 虛弱하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未作桓文事&#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齊桓公 晉文公같이 굳세지 못함이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何所答恩寵&#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恩寵에 어찌 報答하오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向化誠獨至&#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德을 사모하는 정성만은 지극하오이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奸兇敢久息&#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奸兇이 敢히 오래 增加하리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聖運當復熾&#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聖運이 마땅히 다시 盛하오리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天子萬千年&#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天子께서 萬壽無疆하사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小國永賴賜&#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小國이 길이 은혜 입기를!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信齋의 詩는 다음과 같다. 20 200字의 員의 글과는 달리 冷情하게 四言七韻&#160;56자로&#160;읊었을&#160;뿐이다.&#160;序는&#160;똑&#160;같다.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____________________</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style="color: #ef5369;">7</span>)&#160;驛은&#160;譯의&#160;오역.</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br><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大唐有德&#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唐나라는 德을 입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遠方思慕&#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먼 나라들이 思慕했더라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疇昔玉帛&#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옛날에야 寶玉 錦帛이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無有愆&#24734;&#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허물이 없었다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外聞云云&#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바깥 소문으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天王西度&#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天子가 西로 難하셨다던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臣在遠方&#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臣은 먼 곳에 있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未恤霜露&#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수고하심 救恤도 못하였어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蜀山如天&#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蜀山은 하늘인 양 아득하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蜀日如莫&#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蜀땅은 대낮도 저물녘인 양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道里不易&#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길이야 험하다만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怠慢有懼&#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怠慢키 어려워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惟願自倞&#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바라건대 스스로 굳세어져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天王永祚&#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天子의 福이 영원하기를</span></p><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唐 明皇이 安祿山의 亂을 피해 西蜀으로 播遷했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景德王은 먼 데 있어 고생함에 도움도 못되었노라고. 특히 蜀나라 山은 하늘처럼 아스라이 치솟고 蜀나라는 대낮도 저물녘 같아서 行路는 어렵지만, 事大라는 처지에 怠慢했다가는 꾸중이 두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160;바라기는&#160;스스로&#160;굳세어져서&#160;明皇의&#160;國運이&#160;永遠하길&#160;비는&#160;것이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이 自倞은 明皇의 自倞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事大나 해야 되는 스스로에&#160;對한&#160;살뜰한&#160;自倞에의&#160;바람이&#160;아닐는지!〈34호&#160;계속〉 </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_________________________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4">* 覆載부재-하늘이 만물을 덮고 땅이 만물을 받쳐 실음, 곧 하늘과 땅을 이르는 말, 僻陋벽루-매우 누추陋醜하고 궁벽窮僻한 두메, 海隅-바다의 한 구석, 蚤-벼룩 조, 虔-공경할 건, &#23421;臣-불충한 신하, 驕肆-교만하고 방자하다, 宸-대궐 신, 疇-이랑 주/ 누구 주, 愆-허물 건, &#24734;-그릇될 오, 恤-불쌍할 휼, 倞-셀 경, 밝을 량(양).</span></p>
<!-- -->
카페 게시글
한강이만년
이기운 / 원교員嶠와 신재信齋의 〈동국악부東國樂府〉④ / ≪한강문학≫ 34호 권두문학강좌
이혜경
추천 0
조회 25
24.01.01 18:1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