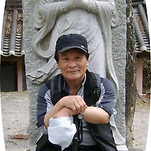<!--StartFragment--><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종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永宗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89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용유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龍游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89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왕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乙旺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왕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89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의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舞衣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바다를 메우고 섬을 연결해 만든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각기 떨어져 있다가 이 공항 건설로 연결돤 섬은 영종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삼목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불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용유도 등 모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조선시대 후기 이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따져보면 합쳐진 섬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가 아니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가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종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삼목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불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용유도가 그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紫燕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우리가 지금 영종도라 부르고 있는 섬의 원래 이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영종도는 자연도 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의 구읍뱃터 일대에 있던 작은 섬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는 김정호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구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동여지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자연도가 나오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동남 쪽 앞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永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섬이 하나 더 그려져 있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중 영종도의 예전 이름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줏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뜻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려 인종 임금 때인 서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123</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중국 송나라의 사신단으로 왔던 서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徐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풍물과 제도 등을 보고 돌아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화봉사고려도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宣和奉使高麗圖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장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長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기록물을 남겼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날 오후 배가 자연도에 머무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곳이 곧 광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廣州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내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산에 의지하여 관사를 지었는데 경원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慶源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알림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방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榜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원정 옆에는 막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幕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십 칸이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민들의 초가집도 많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산 동쪽에 섬 하나가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비가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여기 나오는 경원정은 고려시대중국의 사신이나 상인들이 오가는 길에 묵었던 객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客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의 구읍나루터 주변에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그 동쪽에 자그마한 섬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제비가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경원정이 있는 큰 섬의 이름이 자연도라 불리게 됐다는 얘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편 영종은 원래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관내에 있던 남양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南陽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군사기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종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永宗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나온 이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종실록 지리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종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永宗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萬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남양부의 서쪽에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대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中太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3</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맹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猛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군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無軍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3</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척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각 관의 좌우령 선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船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총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1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처럼 영종진은 원래 남양부에 있던 것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선 효종 임금 때 군사적 필요에 따라 경원정 동쓱에 있던 이 작은 섬으로 옮겨오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곳은 삼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三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방에서 세금으로 받은 곡식을 싣고 올라오는 배들이 거쳐 가는 곳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한강을 통해 한양으로 바로 이어지는 길목이기도 해 국가 방위의 차원에서 무척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런데 영종진은 이 작은 섬에 자리를 잡은 뒤에도 계속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종진이 옮겨오기 전에 이 섬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도 앞에 있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주 작은 섬이기 때문에 아마도 별다른 이름이 없었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앞에서 본 서긍의 기록에 작은 섬의 이름은 안 나오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곳에 제비가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자연도라 부르게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한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이곳에 군사시설인 영종진이 들어섰으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국가 방위 차원에서 중요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종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영종진이 이곳에 자리를 잡은 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세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다리를 만들어 옆에 있는 자연도와 연결을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해오는 얘기로는 효종 임금 때 이 동네 주민들이 구름다리처럼 두 섬을 잇는 다리를 만들었으나 파도에 휩쓸려 부서졌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뒤 현종 임금 때 용궁사 주지였던 승려 해명이 경기도 지역에 있는 승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僧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들을 불러다가 이 다리를 완공시켰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러나 그 뒤로 계속된 두 섬 사이의 매립에 따라 영종진이 있던 작은 섬과 자연도는 하나로 이어지게 됐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필요가 없게 된 다리는 없어지고 말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두 섬은 원래부터 서로 가까울 뿐 아니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사이의 바다도 깊지 않아 썰물 때면 이어질 정도였기 때문에 매립 작업이 쉽게 이뤄질 수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작자와 제작연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서경기해로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海西京畿海路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두 섬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썰물 때가 되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어져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육지가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潮退成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렇게 해서 두 섬이 연결돼 하나가 됐으니 이름도 하나가 돼야 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사라지고 살아남은 이름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는 분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두 개의 이름 중 국가 차원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이름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요한 이름은 이런저런 상황 때마다 계속 불리고 쓰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이름은 불릴 일이 별로 없으니 결국 없어지게 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된 이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해서는 앞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쪽에 섬 하나가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비가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섬의 이름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게 지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기록을 보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이 기록은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무엇보다 제비의 색깔은 대부분 위쪽은 검고 아래쪽은 흰색이어서 어느 면으로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줏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한자로 된 대부분의 우리 옛날 땅 이름이 그렇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紫燕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 당시에 불리던 우리말 이름을 적당한 한자로 바꿔 쓴 것일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비 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날아다니는 새 제비와는 아무 관계없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뜻의 우리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한자 표현에 대해서는 남동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논현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댕구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편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림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무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편 참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늘어졌다는 뜻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한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을 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를 발음이 같으면서 뜻은 더 좋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바꿔 썼다는 얘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곳 자연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종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땅 모양이 가운데에 그다지 높지 않게 솟아있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산 능선이 천천히 늘어지며 내려가기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쓴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하지만 그 앞에 있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해석하기가 어려워 그 우리말 이름이 전체적으로 무엇이었을지는 추론할 수가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앞서 말했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紫燕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한글이 없던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부르던 어떤 우리말 이름을 관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官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 서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書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적당한 한자로 바꿔 적은 이름일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원래의 뜻을 잘 모르는 누군가가 서긍에게 자연도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한자의 뜻에 그대로 맞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줏빛 제비가 많이 날아다녀서 생긴 이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하니 서긍이 이를 곧이곧대로 듣고 자신의 기록에 그</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렇게 남겨놓았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행정구역상으로 영종도는 바로 옆 용유도 등과 함꼐 구한말까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천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仁川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속한 섬 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14</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새로 생긴 부천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富川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편입됐다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73</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경기도 용진군으로 들어왔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98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다시 인천시 중구로 들어와 인천 땅이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한편 영종도의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는 백운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55m)</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영종도에서 가장 높은 이 섬의 주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主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아침 저녁마다 산꼭대기에 흰 구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白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자욱하게 낀다고 해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운산이라는 산 이름은 우리나라 곳곳에 여럿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백운산이나 경상남도 함양군과 전라북도 장수군 경계에 있는 백운산처럼 높이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00m</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넘는 것들도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산들에 비하면 영종도의 백운산은 그 이름에서 꽤나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럼에도 불구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이름을 가진 산들이 대개 그렇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저녁 무렵 석양에 비치는 오색구름이 산봉우리에 머물 때면 선녀들이 내려와 놀고 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 백운산이 섬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영종도에 있는 동네들은 이 산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운서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운남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운북동 등의 이름을 갖게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용유도</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용유도는 영종도 바로 옆에 가까이 있다가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한데 이어져 버린 섬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때문에 이제는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된 섬이기도 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챠 알기 어렵 게 된 섬이기도 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 섬의 이름 유래에 대해서는 흔히 지금의 한자 이름을 그대로 풀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섬의 모양이 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수영을 하며 노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습이어서 생긴 이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설명하곤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모양이 실제 그러한지도 지극히 의심스럽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섬의 이름이 이전에 다른 글자로 쓰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나면 이 해석이 옳지 않다는 것을 금세 인정하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종실록지리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용유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龍流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삼목도 서쪽 수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水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떨어진 곳에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둘레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3</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데 나라의 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필을 놓아먹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水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牧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염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鹽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 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살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증동국여지승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용유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龍流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인천도호부 서쪽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5</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위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5</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리이고 목장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나와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보다 한참 뒤에 나온 김정호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동여지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龍流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 적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런 기록들을 보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용이 수영하는 모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해석은 근세에 들어 누군가가 그저 지금의 한자 이름을 보고 갖다 붙인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龍流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해서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섬의 모양이 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흐르듯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르내리는 모습이어서 생긴 이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해석을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역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용이 수영을 하는 모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해석만큼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용유도는 아마도 이전에 불리던 어떤 우리말 이름을 비슷한 발음의 한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漢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바꾼 것이거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이름을 한자의 뜻으로 받아 새로 만든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근거 있는 자료를 찾아내지 못하는 형편에서는 그 옛 이름을 생각해 내기가 어려운 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결국 지금으로서는 용유도가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왕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왕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용유도에 을왕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乙旺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오래 전부터 해수욕장으로 유명해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곳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 옹진군 시절의 이름 그대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왕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 부르곤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해서는 우선 이곳에 있는 왕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旺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고려 희종왕의 자손이라고 알려진 어떤 왕자의 무덤이 있어 붙은 이름이라는 해석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에 따르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오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五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역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易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속하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은 동쪽을 뜻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해와 달무리를 가리키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굴을 당한 이곳의 왕자 묘지를 보면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결국 동쪽에 있는 왕자의 묘지를 알리기 위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왕마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부르게 됐다는 해석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이는 별다른 증거도 없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너무 막연하기만 한 내용이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동여지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이곳 왕산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임금 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쓰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王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나와 있다는 점을 더한다고 해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왕자와 관련돼서 생긴 이름으로 보기에 꺼림칙한 점이 많기는 마찬가지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이보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느릿하고 길게 늘어진 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뜻의 우리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보는 것이 한결 옳을 듯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nbsp; 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길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단어에 쓰이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잘록한 부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통로 가운데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을 가리키는 우리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곳 땅을 보면 해수욕장과 그 일대 바닷가 뒤로 구릉 같은 산줄기가 병풍처럼 빙 두르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파른 산이 아니라 그다지 높지 않은 산줄기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길게 늘어지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둘러 서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말이 쓰인 것으로 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곳 을왕리 해수욕장은 바다에서 육지 안쪽으로 넓고 깊게 밀려들어온 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형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잘록한 부분을 뜻하는 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다소 무리한 감이 있지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뜻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옛날 이곳 사람들이 섬을 들어오고 나갈 때나 섬 안에서 다닐 때 자주 거쳐야만 했던 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도로 보아야 할 것 같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런데 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한자 이름으로 표시할 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가 없으니까 그 뜻을 가진 글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 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받침을 나타내는 글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새 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붙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09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그 뜻을 가진 한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 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쓴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는 한글이 없던 옛날에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현하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자차용표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漢字借用表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몇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얼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아니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읽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른 예를 들자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石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석 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 쓰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돌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읽거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荒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황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써놓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출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읽는 식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런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 놓은 땅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래의 발음이나 뜻을 잃어버려 그냥 한자대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얼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읽히고 또 불리게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뎌 쉬운 발음으로 바꿔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고 나니 누군가가 여기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왕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王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전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끌어다 붙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글자까지도 거기에 맞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乙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乙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의도</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 용유도 옆에 있는 섬 무의도는 이제 배가 없어도 육지에서 연제든지 건너다닐 수 있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섬 아닌 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용유도와 이 섬을 잇는 무의대교가 개통됐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하나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큰무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미 등의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이 섬은 흔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섬의 모양이 장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將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관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冠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입고 춤을 추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舞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섬의 실제 모습이 그런지도 무척 의문이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에 못지않게 지금의 한자 이름은 길게 잡아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 년 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조선시대의 대표적 지리서라고 할 수 있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증동국여지승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종실록 지리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86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제작된 김정호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동여지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도 이 섬의 한자 이름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無衣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의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나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입고 춤추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아니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입지 않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전국의 가구수와 인구수를 기록한 책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78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발간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호구총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無依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의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적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를 통해 어느 쪽이든 이 섬 이 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지금의 이름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舞衣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조선조 말에 나온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종진지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처음 보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뒤 일제 강점기에 만든 여러 지도나 지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地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료에서 본격적으로 쓰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슨 이유에서 이처럼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의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이름의 뜻을 모르니까 그저 불리는 데에 맞춰 그 발음을 가진 한자를 아무 것이나 골라서 쓴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찌됐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수가 옷을 입고 춤추는 모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야기는 누군가 뒤늦게 지금의 한자 이름을 보고 만들어낸 것임이 틀림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따라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의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우리말로 된 어떤 이름을 한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漢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바꿔 표시하는 과정에서 한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소리만을 빌려 쓴 것으로 보는 것이 한결 타당할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그 우리말 이름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이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어떤 단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무의도는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로 나누어져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들 두 개의 섬 가운데 마을이 크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 대무의도는 지금도 흔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큰무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불리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무의도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떼무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뙤무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불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여기서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한자로 옮겨 쓴 것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리고 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섬사람들이나 어부들이 고기잡이와 관련해 바닷물의 흐름을 나타낼 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두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는 식으로 흔히 쓰는 단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바뀌어 생긴 말로 보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결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물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리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도로 불리던 것이 발음이 바뀌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의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를 한자로 나타낸 것이 무의도일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따라서 이 이름을 나타낸 한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소리만 벨려 쓴 것이기 때문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無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無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舞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br></p>
<!-- -->
카페 게시글
미추홀
[중구편] 영종도
천심
추천 0
조회 70
20.08.10 18:2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