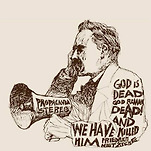<p>* 이하 자료 출처:&nbsp; &nbsp;기초학문자료센터<br></p><p><a href="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amp;m201_id=10013325&amp;res=y"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 style="font-size: 8pt; color: rgb(0, 85, 255);">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amp;m201_id=10013325&amp;res=y</a><br><br><br></p><div class="title"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7px; padding: 17px 3px 8px 0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text-align: justify; clear: both;"><span class="kfont09"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5px 0px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7px; line-height: 24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8, 19, 13); letter-spacing: -1px;">유령과 정의: 자크 데리다의 메시아적 정치학</span></div><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Verdana;"><li class="titleKrm"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9px 1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 height: 30px; background-color: rgb(126, 191, 236);"><span class="kfont2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1px;">연구자가&nbsp;<span class="kfont2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4px; color: rgb(255, 245, 104);">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span>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034.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font: inherit;"></span></li></ul><div class="wrap"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width: 0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26, 191, 236); border-image: initial;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div class="basicInfo"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6px;"><table class="basicInfoTable"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border-top: 1px solid rgb(126, 191, 236); border-bottom: 2px solid rgb(203, 203, 203); width: 718px;"><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사업명</td><td class="kfont15" colspan="3"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nbsp;<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hwpicon_16.gif" alt="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title="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 cursor: pointer;">&nbsp;</span><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a href="https://www.krm.or.kr/krmts/sdata/frbr/bizmap/2006/2006_332.pdf"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pdficon_16.gif" alt="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title="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 cursor: pointer;"></a>&nbsp;</span>]</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연구과제번호</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2006-332-A00310</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선정년도</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2006 년</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연구기간</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1 년 (2006년 07월 01일 ~ 2007년 06월 30일)</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연구책임자</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a title="연구자의 수행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이택광</a>&nbsp;<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009.gif" alt=""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nbsp;<span id="mgrCountInfo" class="authorInfo"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115, 115, 115); word-spacing: -3.5px;">[ NRF 인문사회&nbsp;<span class="kfont1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4px; color: rgb(33, 33, 33);">연구책임 3회 수행&nbsp;</span>/&nbsp;<span class="kfont1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4px; color: rgb(33, 33, 33);">공동연구 5회 수행&nbsp;</span>/&nbsp;<span class="kfont1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4px; color: rgb(33, 33, 33);">학술논문 25편 게재&nbsp;</span>/&nbsp;<span class="kfont1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4px; color: rgb(33, 33, 33);">총 피인용 39회&nbsp;</span>]</span>&nbsp;<a href="https://www.kci.go.kr/kciportal/po/citationindex/poCretDetail.kci?citationBean.cretId=CRT000266359"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authorInfoKci.gif" alt=""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a></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연구수행기관</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a title="기관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광운대학교</a></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과제진행현황</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종료</td></tr></tbody></table></div><div class="researchSum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20px; padding: 30px 0px 10px 2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6px; text-align: justify;"><div class="title"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7px; padding: 3px 3px 15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clear: both;"><img class="paragraphIcon"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title_011.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1px 0px; font: inherit; float: left;">과제신청시 연구개요</div><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3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quot;/krmts/img/common/002.gif&quot;);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goal_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 alt=""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1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연구목표</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overflow-wrap: break-word;"><div id="goal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정의와 윤리 문제를 이슈로 제기하면서 빈번하게 정치영역에 개입했는데, 이는 초기에 주로 철학과 문학 담론을 중심으로 보여주었던 해체를 사회적 담론의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초기 데리다와 후기 데리다를 연결짓는 고리들을 찾아서 그의 작업을 이끌어 갔던 내적 논리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데리다의 정치학이 초기 비평부터 일관되게 해체적 기획 속에 내재하고 있었고, 또한 그 나름대로 교착된 유럽식 좌우대립의 정치담론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데리다의 정치학이 최근 서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독일의 문예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역사철학을 전유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입장에서 데리다가 어떻게 서구 맑스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br style="box-sizing: border-box;"></div></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3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quot;/krmts/img/common/002.gif&quot;);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expectedEffect_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 alt=""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1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기대효과</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overflow-wrap: break-word;"><div id="expectedEffect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프랑스 철학자 데리다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동향은 주로 그가 수행한 철학적 해체작업과 문학비평행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런 데리다의 후기사상에 대한 집중적 연구는 아직 미진한 형편이다. 이런 배경에서 어떤 유럽의 이론가보다도 영미문학비평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철학자가 말년에 심혈을 기울였던 정치와 윤리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데리다의 정치성을 후기에 이르러 갑자기 도드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사상과 이론에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서 데리다의 후기 사상에 접근할 것이다. 이런 접근은 기존에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후기 데리다의 정치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데리다의 해체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데리다의 [맑스의 유령](Specters of Marx)과 [법의 힘](The Force of Law)을 그의 다른 후기 저작들과 연관지어 분석함으로써 후기 데리다의 메시아주의적 정치학과 그 의미를 그의 맑스와 벤야민 읽기 방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데리다의 맑스와 벤야민 읽기가 현실비평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함의를 내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비평행위에서 좌우의 이념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정치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를 탐색할 것이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div></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3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quot;/krmts/img/common/002.gif&quot;);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summary_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 alt=""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1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연구요약</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overflow-wrap: break-word;"><div id="summary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본 연구는 폭력과 정의, 그리고 윤리에 대한 데리다의 관점을 고찰하기 위해 벤야민과 맑스에 대한 데리다의 해석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데리다의 정치학을 구성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런 과정은 일방적으로 데리다의 주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해체가 발현시키는 해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동반하는 것이다. 데리다의 정치학은 근본적으로 폭력의 형이상학적 측면을 비판하고, 이런 형이상학의 근저에 유령처럼 드리운 정의의 그림자를 불러내어 제대로 대접하는 행위다.이런 까닭에 데리다의 정치학은 타자의 죽음에 대한 애도(mourning)에서 출발한다. 타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은 낯선 타자와 어떻게 정의로운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유발한다. 여기에서 애도는 정치적 정의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애도는 타자를 잊어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온전하게 보전하는 행위이며, 이렇게 기억을 보전하는 행위가 정의를 출몰시키는 것이다. 애도는 정의에 대한 파악이며 동시에 이런 파악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윤리적 문제에 답을 내리려는 시도를 유발한다. 데리다에 따르면, 애도는 정의의 명령에 따른 작업(work)이다. 애도 작업은 여러 작업 중 하나가 아니라, “작업 그 자체다”. 말하자면,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상징계처럼, 애도 작업은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애도는 입사(introjection)와 합체(incorperation) 사이에 위치하면서 주체의 출현 자체를 예비한다. 이 주체는 물론 수행적 주체로서 행하는 자다. 이 주체는 “맹세하고, 그 맹세를 선언하며, 그래서 약속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한 마디로 우리를 실천에 참여시키는 행위”이다. 데리다는 이런 수행성을 일컬어, “해석하는 것 자체를 전환시키는 해석”이라고 정의한다. 이 해석은 담론적 해석 밖에서 해석을 사유하도록 하는 무엇이다. 칼 맑스(Karl Marx)가 정치경제학 비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그 지점에서 데리다는 유령(spectre)을 발견한다. 애도를 통해 출몰하는 것이 바로 유령이다. 데리다에게 유령은 현전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유령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은 데리다에게 무의미하다. 오히려 데리다에게 주어야할 정확한 질문은 유령은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이다.</div></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3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quot;/krmts/img/common/002.gif&quot;);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한글키워드</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overflow-wrap: break-word;">데리다,포스트구조주의,맑스,벤야민,주체,탈근대적 정치학,해체주의,윤리</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3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quot;/krmts/img/common/002.gif&quot;);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영문키워드</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overflow-wrap: break-word;">postmodern politics,Poststructuralism,ethic,subject,Benjamin,Derrida,Marx,Deconstruction</li></ul></div><div class="resultReport"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0px 10px 2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6px; text-align: justify;"><div class="title"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30px 0px 17px; padding: 3px 3px 8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clear: both;"><img class="paragraphIcon"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title_011.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2px 0px; font: inherit; float: left;">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div><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1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quot;/krmts/img/common/002.gif&quot;);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digestKor_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 alt=""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2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국문</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div id="digestKor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본 연구는 자크 데리다의 정치학을 유령과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리다에게 정의는 법과 다른 것이다. 법은 힘으로써 정의를 집행할 뿐이다. 정의는 이 집행 너머에 존재한다. 오히려 정의는 법이 아니라, 이 법과 다른 차원에 있는 애도 작업을 통해 호출당하는 것이다. 이 호출은 죽은 자를 불러냄으로써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not-yet-being) 또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다. 이런 맥락에서 데리다의 용어법에서 애도-유령-정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은 존재론(ontology)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the ethic)의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이 윤리는 존재론적 실체성을 갖는 것이다. 이 실체성은 존재이면서 존재가 아닌, 유령의 질감이다. 데리다에 따르면, 애도는 정의의 명령에 따른 작업(work)이다. 애도 작업은 여러 작업 중 하나가 아니라, "작업 그 자체다. 말하자면,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상징계처럼, 애도 작업은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애도는 입사(introjection)와 합체(incorperation) 사이에 위치하면서 주체의 출현 자체를 예비한다. 이 주체는 물론 수행적 주체로서 행하는 자다. 이 주체는 "맹세하고, 그 맹세를 선언하며, 그래서 약속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한 마디로 우리를 실천에 참여시키는 행위"이다. 이 행위는 수행적인 것으로, 데리다는 이런 수행성을 일컬어, "해석하는 것 자체를 전환시키는 해석"이라고 정의한다. 이 해석은 담론적 해석 밖에서 해석을 사유하도록 하는 무엇이다. 칼 맑스(Karl Marx)가 정치경제학 비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그 지점에서 데리다는 유령(spectre)을 발견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요지이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div></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1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quot;/krmts/img/common/002.gif&quot;);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digestEng_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 alt=""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2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영문</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div id="digestEng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It is not unusual to regard Jacques Derrida, the founder of Deconstruction, as de-Marxified philosopher, who attacks the any doctrine of politics, not to mention Marxism. However, the essay considers another aspect of his theory, related to the alternative politics in terms of the ethic. What must be stressed is that Derrida adapts Walter Benjamin's perspective and develops the political concept of justice in terms of the ethic. Therefore, the aim of the essay is to explore Derrida's conceptualization of justice in his formulation of the ethic. He involves the traditional discourse of politics by raising the argument of a spectre and claims that mourning, a spectre, and justice are relevant to each other; the binding those is the very point of thinking justice against the conventional concep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law. The essay shed light on the way in which Derrida reads Marx with this own perspective, and argues that the reading of Marx would give us an insight into the situation of the political, the one in which we can overcome the ossified status of politics by introducing the messianic dimension into the political discourse -- it is the very attempt that Theodor W. Adorno defends the category of critique in terms of the aesthetic.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ot wrong to say that Derrida's politics is firmly constructed on the context of Western radical philosophy.<br style="box-sizing: border-box;"></div></li></ul><div class="title"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30px 0px 17px; padding: 3px 3px 8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clear: both;"><img class="paragraphIcon"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title_011.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2px 0px; font: inherit; float: left;">연구결과보고서</div><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1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quot;/krmts/img/common/002.gif&quot;);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summ_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 alt=""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2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초록</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div id="summ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본 연구는 해체주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를 정치의 관점에서 읽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맑스와 맑스주의에 대한 데리다의 언급을 살펴보고, 데리다의 정치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적 맥락과 층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데리다에 따르면, 정의는 법과 다른 것이다. 법은 힘으로써 정의를 집행할 뿐이다. 정의는 이 집행 너머에 존재한다. 오히려 정의는 법이 아니라, 이 법과 다른 차원에 있는 애도 작업을 통해 호출당하는 것이다. 이 호출은 죽은 자를 불러냄으로써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not-yet-being) 또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다. 이런 맥락에서 데리다의 용어법에서 애도-유령-정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은 존재론(ontology)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the ethic)의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이 윤리는 존재론적 실체성을 갖는 것이다. 이 실체성은 존재이면서 존재가 아닌, 유령의 질감이다. 데리다의 용법에서 애도는 정의의 명령에 따른 작업(work)이다. 애도 작업은 여러 작업 중 하나가 아니라, "작업 그 자체다". 말하자면, 자크 라캉의 상징계처럼, 애도 작업은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애도는 입사(introjection)와 합체(incorperation) 사이에 위치하면서 주체의 출현 자체를 예비한다. 이 주체는 물론 수행적 주체로서 행하는 자다. 이 주체는 "맹세하고, 그 맹세를 선언하며, 그래서 약속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한 마디로 우리를 실천에 참여시키는 행위"이다. 이 행위는 수행적인 것으로, 데리다는 이런 수행성을 일컬어, "해석하는 것 자체를 전환시키는 해석"이라고 정의한다. 이 해석은 담론적 해석 밖에서 해석을 사유하도록 하는 무엇이다. 맑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그 지점에서 데리다는 유령을 발견한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애도를 통해 출몰하는 것이 바로 유령이다. 데리다에게 유령은 현전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유령은 &lt;햄릿(Hamlet)&gt;에서 제기되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는 문제에 대한 응답이다. 유령은 정의의 자리이다. 이 자리는 해체 불가능한 범주로서 호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유령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은 데리다에게 무의미하다. 오히려 데리다에게 주어야할 정확한 질문은 유령은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나라"야말로 죽음이다. 이 나라의 경계선에서 유령은 떠돈다. 죽음은 결국 미지이고, 합리적 이성의 추론이 광기와 범벅되는 지점이다. 이 광기의 자리로 유령은 현신한다. 그래서 유령은 광기의 논리다. 고쳐 말한다면, 유령을 불러내는 광기야말로 "정의에 신들린 행위"인 것이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div></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1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quot;/krmts/img/common/002.gif&quot;);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연구결과 및 활용방안</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div id="resultAdvantage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데리다의 후기 철학이 많은 부분 벤야민의 정치학에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논문을 작성해서 유수 학술지에 발표할 생각이다. 또한 후속 작업으로 데리다의 정치학을 논하는 단행본 작업을 고려하고 있다.</div></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1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quot;/krmts/img/common/002.gif&quot;);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색인어</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데리다, 맑스, 정치학, 애도, 유령, 정의, 법, 현대철학, 비평이론, 문화연구</li></ul></div><div class="classif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10px 0px 0px; padding: 10px 0px 5px 10px; border-width: 1px 0px 0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initial;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rgb(226, 226, 226);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initial;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6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1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5px 0px 1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115, 115, 115);">이 연구과제의 신청시 심사신청분야(최대 3순위까지 신청 가능)</li><li class="kfont1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5px 0px 1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115, 115, 115);"><span class="kfont11Black"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5px 0px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color: black;">1순위 :&nbsp;</span><a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A000000" title="인문학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인문학</a>&nbsp;<span id="classifyCount00" class="dtClassifyCount"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color: rgb(255, 102, 0);">(358,893)</span>&nbsp;<span class="separato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 inherit; color: black;">&gt;</span>&nbsp;<a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A150000" title="영어와문학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영어와문학</a>&nbsp;<span id="classifyCount01" class="dtClassifyCount"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color: rgb(255, 102, 0);">(30,873)</span>&nbsp;<span class="separato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 inherit; color: black;">&gt;</span>&nbsp;<a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A150200" title="영문학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영문학</a>&nbsp;<span id="classifyCount02" class="dtClassifyCount"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color: rgb(255, 102, 0);">(7,701)</span>&nbsp;<span class="separato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 inherit; color: black;">&gt;</span>&nbsp;<a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A150210" title="영미문학비평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영미문학비평</a>&nbsp;<span id="classifyCount03" class="dtClassifyCount"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color: rgb(255, 102, 0);">(638)</span></li></ul></div></div><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Verdana;"><li class="titleOutcomeList"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30px 0px 0px; padding: 9px 1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 height: 30px; background-color: rgb(126, 191, 236);"><span class="kfont2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034.gif" alt=""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font: inherit;">&nbsp;연구성과물 목록</span></li></ul><div id="innerHtm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text-align: center;"><div class="innerExpList"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5px; border-width: 2px 0px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rgb(126, 191, 236);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126, 191, 23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6px;"><table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12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valign="to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10px 0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80px"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3px 0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div class="birdyellow" title="SD Data"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1. 논문</div></td></tr></tbody></table></td><td valign="to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table width="60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valign="to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2px 0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icon_kci_reg.png" alt="KCI등재" class="birdyellow" title="KCI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nbsp;<a href="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OrteServHistIFrame.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56980&amp;sereArticleSearchBean.orteFileId=KCI_FI001356980"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img alt="KCI 원문 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014.gif" class="birdyellow" title="KCI 원문 PDF를 다운로드합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a></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width="600px"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height: 30px;"><a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3px 0px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유령과 정의: 자크 데리다의 정치학</a></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width="600px"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3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이택광 | 한국비평이론학회 | 비평과이론 | 14권(1호) | pp.85~101 | 2009-06-01 | 영어와문학<br style="box-sizing: border-box;">피인용횟수 : 3<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4"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75, 75, 75); width: 600px;">출처연구과제 : 유령과 정의: 자크 데리다의 메시아적 정치학</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7"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height="1" background="https://www.krm.or.kr/include/bird/ko/images/krmts/common/002.gif"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12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valign="to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10px 0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80px"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3px 0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div class="birdyellow" title="SD Data"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2. 보고서</div></td></tr></tbody></table></td><td valign="to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table width="60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valign="to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width="600px"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icon_nrf_final.png" alt="연구결과물" class="birdyellow" title="지원연구 결과물입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width="600px"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height: 30px;"><a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red;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3px 0px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outline-offset: -2px;">(결과보고)유령과 정의: 자크 데리다의 메시아적 정치학</a></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width="600px"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3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quot;Nanum Gothic&quot;, 나눔고딕, &quot;Nanum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4"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75, 75, 75);">이택광 | 2007-12-27 | 영미문학비평</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4"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75, 75, 75); width: 600px;">출처연구과제 : 유령과 정의: 자크 데리다의 메시아적 정치학</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7"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PDF(1)</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div><div><br></div><p><br></p>
<!-- -->
카페 게시글
데리다
[연구] 유령과 정의: 자크 데리다의 메시아적 정치학 (2006)
고스트인더쉘
추천 0
조회 64
20.03.16 19:3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