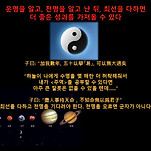<P></P>
<H1 class=firstHeading><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1pt">
<P class=HS1><SPAN bold; FONT-SIZE: 13px; COLOR: #008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왕필(王弼)의 주역 해석</SPAN><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class=HS2><SPAN bold; FONT-SIZE: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ff6600;></SPAN>&nbsp;</P>
<P class=HS2><SPAN bold; FONT-SIZE: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ff6600;>&#9642; 참고 자료</SPAN><SPAN bold; FONT-SIZE: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ff6600;></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TRONG><FONT #ffef00?><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왕필, 《주역약례(周易略例)》(임채우 옮김, 《주역 왕필주》에 실려 있음. 623~646쪽)를 모두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SPAN> </FONT></STRONG></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1. 왕필(王弼) 역학(易學)의 배경</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1.1. 한나라 때 참위적인 상수역학(象數易學)의 만연 (‘보강’ 참조)</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1.2. 위진(魏晉)·수당(隋唐)시대의 역학</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상수역학, 노장현학역학, 불교와 역학의 결합, 도교와 역학의 결합 등의 경향이 나타남.</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정현의 상수역학에 맞서 위진시대 초기에 왕숙(王肅) 학파가 등장하고, 왕숙을 이어받은 왕필(王弼)이 현학(玄學)으로써 《주역》을 풀이하여 의리역학의 기념비를 세움.</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1.3. 왕숙(王肅)과 의리역학의 부활</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열여덟 살에 《태현(太玄)》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였다.”(《魏志》&lt;王肅傳&gt;)</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주역주(周易注)》 10권을 저술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하지 않고, 다른 책에 인용된 일문(逸文)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음.</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상수역학을 멀리하고 역학 해석에서 의리(義理)의 탐구를 중시함. 《역전(易傳)》의 전통을 되살려 《역전》의 문장으로 《역경》을 해석함.</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왕필은 왕숙의 설을 계승함.</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2. 왕필(王弼, 226~249)의 역학</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2.1. 생애</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아버지 왕업(王業)은 상서랑(尙書郞)을 지냈고, 할아버지 왕개(王凱)는 한나라 말 문인. 건안칠자(建安七子)라 불리는 한나라 건안 연간 문인 7인 가운데 한 사람인 왕찬(王粲)은 왕개의 친형제.</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조상(曹爽) 정권 때 현학자(玄學者)인 하안(何晏) 밑에서 상서랑이라는 낮은 벼슬을 지냄.</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노자》《장자》《주역》에 조예가 깊었으며, 이를 ‘삼현(三玄)’이라 부름. 이 현학(玄學)의 시각에서 《논어》의 해석을 시도. 당시 주제인 명교(名敎)와 자연(自然)의 합일을 탐구.</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24살에 요절한 짧은 생애 가운데 《노자주(老子注)》《주역주(周易注)》《주역약례(周易略例)》《논어석의(論語釋疑)》 등 네 권의 저서를 남김. 이 가운데 《논어석의》는 전하지 않고 황간과 형욱 등의 저서에 일부 일문(逸文)이 전해져 옴.</SPAN> </P>
<P><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SPAN>&nbsp;</P>
<P><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SPAN><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nbsp;&nbsp;&nbsp; <IMG height=42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yosulmangtto.co.kr%2Fimg%2F%2525BF%2525D5%2525C7%2525CA%2525C1%2525D6%2525BF%2525AA%2525C1%2525D6_%2525C7%2525F6%2525C1%2525B8%2525C3%2525D6%2525B0%2525ED%2525B0%2525A2%2525BA%2525BB_%2525BC%2525DB%2525BC%2525F8%2525C8%2525F1%2525B0%2525A3%2525B9%2525AB%2525C1%2525D6%2525B0%2525F8%2525BB%2525E7%2525B0%2525ED%2525B0%2525A2%2525C1%2525A6%2525BC%2525F6%2525BA%2525BB_xuande.jpg" width=320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 pointer;?>&nbsp;</A></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8pt;>* 현존하는 왕필 《주역주》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각본의 하나인 송순희간무주공사고각체수본(宋淳熙間撫州公使庫刻遞修本).</SPAN><SPAN 8pt?> </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nbsp;</P></SPAN>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2.2. 역학 방법론</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왕필은 득의망상(得意忘象)설, 취의(取義)설, 효위(爻位)설 등 독특한 《주역》 해석학 이론을 전개.</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한나라 때 상수역학의 번거롭고 견강부회 많은 미신적인 내용을 힘써 배척.</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주역》을 해석하면서 노장철학의 현학(玄學)적 내용과 정치철학을 전개. 한 괘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정치적 현실로 이해하면서 논의를 전개.</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1) 득의망상(得意忘象)설</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왕필은 《주역》을 해석할 때 ‘의미’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의미를 얻으면 상(象)은 잊을 것을 주장했음. 여기에는 상(象)을 논하느라 《주역》의 의미를 상실한 한대의 상수역학을 비판하는 의미도 담겨 있음.</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夫象者, 出意者也。言者, 明象者也。盡意莫若象, 盡象莫若言。言生於象, 故可尋言以觀象; 象生於意, 故可尋象以觀意。意以象盡, 象以言著。故言者所以明象, 得象而忘言; 象者, 所以存意, 得意而忘象。猶蹄者所以在&#20820;, 得&#20820;而忘蹄; 筌者所以在魚, 得魚而忘筌也。然則, 言者, 象之蹄也; 象者, 意之筌也。是故, 存言者, 非得象者也; 存象者, 非得意者也。象生於意 而存象焉, 則所存者乃非其象也; 言生於象而存言焉, 則所存者乃非其言也。然則, 忘象者, 乃得意者也; 忘言者, 乃得象者也。得意在忘象, 得象在忘言。故立象以盡意, 而象可忘也; 重&#30059;以盡情, 而&#30059;可忘也。(王弼, 《周易略例》&lt;明象&gt;)</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2) 취의(取義)설</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괘사와 효사를 해석할 때 의리(義理)만을 말하고 괘변(卦變), 호체(互體), 취상(取象) 등 한나라 때 상수역학의 이론을 모두 배척함.</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팔경괘의 해석에도 취의설을 택해, 건(乾)은 굳건함, 곤(坤)은 유순함, 진(震)은 두려워 떪, 손(巽)은 거듭 명령함, 감(坎)은 위험에 빠짐, 리(離)는 붙음, 간(艮)은 그침, 태(兌)는 기쁨이라고 하였음.</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상(象) 또한 의(義)가 있고난 뒤에 생겨난다고 주장.</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觸類可&#28858;其象, 合義可&#28858;其徵。義苟在健, 何必馬乎? 類苟在順, 何必牛乎? 爻苟合順, 何必坤乃&#28858;牛? 義苟應健, 何必乾乃&#28858;馬? 而或者定馬於乾, 案文責卦, 有馬(無)乾, &nbsp;則&#20605;說滋漫, 難可紀矣。互體不足, 遂及卦變; 變又不足, 推致五行。一失其原, 巧愈彌甚。從復或&#20540;, 而義(無)所取。蓋存象忘意之由也。忘象以求其意, 義斯見矣。(王弼, 《周易略例》&lt;明象&gt;)</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3) 효위(爻位)설</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BR></SPAN></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lt;단전(彖傳)&gt;·&lt;소상전(小象傳)&gt; 등 《역전》에 등장한 효위설을 이어받아, 이를 위주로 《역경》을 해석하고, 취상·호체·괘변·납갑 등의 상수역학을 배척함.</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한 괘에서 하나의 효가 주효(主爻)가 된다는 주효설을 발전시킴.</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SPAN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夫彖者, 何也? 統論一卦之體, 明其所由之主者也。夫&#30526;不能治&#30526;, 治&#30526;者, 至寡者也。夫動不能制動, 制天下之動者, 貞夫一者也。故&#30526;之所以得咸存者, 主必致一也; 動之所以得咸運者, 原必(無)二也。(王弼, 《周易略例》&lt;明彖&gt;)</SPAN> </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nbsp;</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nbsp;</P>
<P 13px; COLOR: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000000; MARGIN: 0px 30px; TEXT-INDENT: -13px;>자료출처 : <A href="http://yosulmangtto.co.kr/875"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yosulmangtto.co.kr/875</FONT></A></P></SPAN></SPAN></H1><!-- --><!-- end clix_content -->
<!-- -->
카페 게시글
◈ 주역周易
■ 왕필(王弼)의 주역 해석
혜명
추천 0
조회 1,227
11.04.06 03:1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