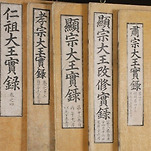<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b>조선시대 이혼에 대한 규제와 그 실상 ③</b></span></p><p style="font: 12px/16.36px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5;"></p><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16.36px; font-family: 돋움; position: absolute; opacity: 0; background-color: rgb(53, 46, 44);"></div><p>&nbsp;</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b>(②편에 이어서)</b></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b><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b></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line-height: 1.5;"><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b>5)<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피로여성(被擄女性)의 이혼</b></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임진&#8228;병자 양난은 국가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피해와 고난을 겪었던 사건이었지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당 시 여성들에게는 이중의 질곡을 안겨 준 사건이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당시 일본군이나 청군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적지 않은 여성들이 성적 만행을 당했을 뿐 아니라,<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종전 후에도 순절하지 못하고 살아서 돌아 온 것을 이유로 사회로부터 백안시되고 남편으로부터 이혼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와 같이 자신의 처가 적군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남편이 처와 이혼할 것을 국가에 요청할 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국가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허락하기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인정상 가혹하게 여겨질 뿐 아니라,<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들 여성들이 납치되어 오욕을 당하게 만든 궁극적인 책임이 어디까지나 국가에 있었기 때문이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러나 한편<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실절한 자로써 배필을 삼는 것도 이미 실절이다”125)라는 논리를 받아들였던 사대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피로여성들과 혼인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과연 조선사회에서 피로여성의 이혼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임진왜란부터 검토해 보도록 한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93, 193, 193);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21)《숙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3,</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숙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7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8월 병신.</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22)《영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88,</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영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2년 윤</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9월 기해.</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23)《영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91,</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영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4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월 병술.</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24)《星湖僿說》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4,</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人事門,</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絶婚.</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25)《효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효종 즉위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1월 병자.</span></p></div><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임진왜란은 무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7년이나 계속된 전쟁으로,<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당시 절개를 지켜 죽은 부녀자가 효자&#8228;충 신보다 그 수가 많았다고 한다.126)<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러나 목숨을 버린 열녀 못지 않게 살아남은 사족녀들도 적지 않았던 듯,<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변고를 당한 집안과 혼인하지 않으려는 풍조에 대해 선조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 풍습이 만약 오래 간다면 나라 안의 큰 가문이 거의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통탄하며 왕가의 친인척들에게 이들과 혼인하도록 권하였다는 기록도 있다.127)<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처럼 많은 사족녀들이 연루되었고 국난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빚어진 변고였기 때문에,<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국가에서 이들 피해여성들에 대한 이혼을 공식적으로 허락하기란 곤란한 일이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선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39년에 왜적에게 몸을 더럽혔다는 것을 이유로 선처를 버리고 종실녀를 후처로 맞았던 차천낙(車天駱)에 대해<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먼저 들인 사람을 적(嫡)으로 삼는다”는《경국대전》의 규정을 근거로 선처를<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적(嫡)’으로 삼도록 조치하였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128)</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임진왜란시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차천로의 사례 외에는 실록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뿐만 아니라,<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선조가 여타 피해여성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언급도 당시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후일의 기록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후일 병자호란을 당해 납치되었던 여성과의 이혼을 허락할 것인가의 여부가 언급될 때마다 이혼을 허락하지 말자는 입장을 취했던 관료들이 항상 그 전거로 삼았던 것이 선조년간의 이혼불허정책이었던 것이다.129)<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러나 효종조에 인조실록의 편찬을 담당했던 사신이 논평을 통해<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당시의 전교(傳敎)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근거할 만한 것이 없다”130)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처를 취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결국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혼을 허락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사대부가에서는 피해여성을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위의 차천로의 경우에도 실록의 기록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중 차천로의 장인 기재란에 종친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131)으로 미루어 선조의 이혼불허 조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혼하고 종실녀를 후처로 맞아들였다고 보인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93, 193, 193);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2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李崇寧이 광해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9년에 간행된《東國新續三綱行實》에 의거해 임진&#8228;병자왜란시의 순절로 旌門된 숫자를 통계 낸 것에 의하면 효자</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67건,</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충신</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1건,</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열녀</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56건으로 열녀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962,〈임진왜란과 민간인피해에 대하여〉,《역사학보》17&#8228;18).</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nbsp;</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27)</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李肯翊,《燃藜室記述》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7,</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宣祖朝故事本末〈亂中時事摠錄〉.</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28)《선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95,</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선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9년 정월 신묘.</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29)《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월 갑술;《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6월 갑진.</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30)《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월 갑술.</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31)</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謁聖榜 丙科 합격자인 차천로의 인적사항에 처부가 錦川正</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李)&#20428;로 기재되어 있다(1988,</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태학사 영인본 제</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권, 534쪽).</span></p></div><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임진왜란과 달리 병자호란시 피로여성의 이혼 여부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게 기록이 남아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청과의 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납치된 여성에 대한 대규모 속환이 이루어진 때문에 국가에서 임진왜란 때와 같이 이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병자호란 직후 문제로 제기된 효종비의 오빠 장선징(張善&#28546;)<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처의 사례132),<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전 승지(前承旨)<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한이겸(韓履謙)<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딸의 사례133),<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속환 직후에는 이혼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후일 자손의 금고 여부가 문제된 최선(崔宣)의 어머니 권씨(權氏)의 사례134)<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등이 그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위의 사례 중 유일하게 이혼이 허락된 경우가 장선징 처의 경우인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 경우도 피로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장선징의 아버지 장유(張維)가 이혼을 요청하였을 때는 허락되지 않다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후일 어머니가 불효를 이유로 다시 이혼을 요청하여 허락된 사례135)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때 이혼을 허락하면서 인조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미<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결정 하였으니,<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지금 다시 고치기는 어렵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러나 훈신(勳臣)의 독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특별히 그의 요청을 윤허하니,<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후일 이 일로 관례를 삼지 말라”고 하였던 것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피로여성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와 같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던 사족녀라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혼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국가에서 전후 포로의 속환을 추진하고 있었고 속환 대상으로 부녀자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던 탓으로136),<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속환 부녀자들의 이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또한 여기에는 청과의 화친을 주장하며 호란 후 전후수습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좌의정 최명길(崔鳴吉)의 이혼불허 입장이 적지 않게 반영되었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오욕을 입은 부인은 역적 집안의 자손보다 더 심하다”며 피로여성의 이혼을 강력히 주장한 영돈령부사 이성구(李聖求)를 제외하면137)<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당시 대다수 관료들의 입장은 이혼의 허락 여부를 국가에서 간여하지 말고 개개 사대부 가문에 일임하자는 타협론이었다.138)<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럼에도 최명길은 첫째,<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임진왜란 후 선조가 이혼을 불허하였다는 것,<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둘째,<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혼을 허락하게 된다면 속환하려는 사람이 없게 될 것,<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셋째,<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포로로 잡힌 부녀들을 모두 실행했다 논할 수 없다는 것,<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넷째,<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사대부 개개 가문에 일임하자는 것은 한 나라의 법을 둘로 만들어 왕자의 정치로서 구차하다는 것 등의 이유를 들며 이혼불허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여 인조의 허락을 받게 되었다.139)</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93, 193, 193);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32)《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월 갑술.</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33)</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위와 같음.</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34)《현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4,</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현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8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9월 신유.</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35)《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41,</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8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9월 경자.</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3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朴容玉, 1964,〈丙子亂被擄人贖還考〉,《史叢》9.</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37)《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6월 갑진.</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38)《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5월 계해;《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6월 갑진.</span></p></div><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렇게 인조 대에는 대규모 속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전후의 상황과 최명길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이혼불허 방침이 공식적으로 표명되었지만140),<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피로여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당시의 사류들이141)<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들을 그대로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인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16년에 장선징의 이혼요청을 불허하였다는 기사 말미에<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후로 사대부 집안의 자제는 모두 다시 혼인하고,<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도로 합하는 자가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142)가 실리고 있는 것을 보면,<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국가의 공식적인 조처와 달리 실제로는 피로여성들이 대부분 이혼을 당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뿐만 아니라 인조가 죽은 후,<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북벌을 강력히 추진하던 효종이 즉위하자 송준길(宋浚吉)과 송시열(宋時烈)을 비롯한 청서파(淸西派)<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사류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면서 피로여성들과의 이혼을 공식적으로 허락하게 되었으니143),<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최명길의 현실론적 견해보다는 성리학적 명분론이 발언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b>3.<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협의이혼</b></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대명률》에는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명실상부한 협의이혼의 실제 사례는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흔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협의이혼에 관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이미 부부가 합의를 보아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러나 형식은 협의이혼이라도 내용은 일방성을 띠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러한 경우는 통상 남편의 강박에 의해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컸으리라 보인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러나 때로는 처가 남편을 핍박하여 억지로 이혼 합의문서를 받아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93, 193, 193);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39)《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월 갑술;《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6월 갑진.</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40)</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森岡康은 인조 대에 피로여성에 대한 이혼 여부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으나 애매한 타협론으로 결말이 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1963,〈贖還披擄婦人の離異問題에 ついて〉,《조선학보》</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6집),</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에서는 이혼불허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니 이는 사실과 다르다.</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41)《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5월 계해.</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42)《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월 갑술.</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43)《효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효종 즉위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1월 병자;《숙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40,</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숙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0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9월 임술.</span></p></div><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남편을 혐오하여 강제로<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기별문자(棄別文字)’를 받아내었던 환관(宦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한세보(韓世甫)의 처 박씨(朴氏)의 경우144)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다른 남자와 재혼하기 위하여 남편 최희(崔希)로부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기별명문(棄別明文)’을 강제로 받아내어 재혼한 양녀(良女)<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분경(分京)145)과,<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핍박을 가하여 남편으로부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기별지문(棄別之文)’을 받아낸 후 재혼한 강복(姜輻)의 처 고씨(高氏)의 경우146)<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등이 그것이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비록 처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남편이 처에게 이혼문서를 써주었다는 것은 부부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라고 분류하여도 무방할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러나 처가 강요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는 국가에서 이를 불법적 이혼으로 간주하여 장<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80의 형벌을 부과하였으니,<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는 협의이혼의 규정이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렇게 처가 남편에게 강압적으로 이혼문서를 작성케 하여 협의이혼을 위장했던 것은 조선시대에 처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중종 대에 남편의 늙고 추한 얼굴에 불만을 품어 혼인한 후<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6~7년 동안 동거를 거부했던 판관 홍태손(洪泰孫)의 처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직접 이혼을 요청하지 못하고 남편을 모욕하고 멸시하여 남편 스스로 이혼을 요청하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으리라 보인다.147)<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 경우도 비록 형식상으로는 남편의 요청에 의한 일방적 이혼이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처의 요구에 남편이 동의하였다는 의미에서 협의이혼이라고 할 수 있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조선중기까지는 위장된 형태로나마 협의이혼의 사례가 간혹 나타나지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조선후기에는 위장 여부를 떠나 협의이혼의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는 부부간의 합의로 원만히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별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사족층에서 이혼이 극히 금기시되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다만 국가에서 깊이 간여하지 않았던 일반민들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제까지 살펴본 이혼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 또는 남편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규정상으로만 본다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구타 당했을 때나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할 경우에는 부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실제로는 기능하기 어려운 조항이었던 것이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93, 193, 193);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44)《세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3,</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세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8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9월 신축.</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45)《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년 정월 신사.</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46)《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0,</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9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4월 무자.</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47)《중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1,</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중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2년 윤12월 신묘.</span></p></div><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b>Ⅳ.<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불법적 이혼의 처벌</b></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span style="line-height: 1.8;">&nbsp;</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이혼에 대한 제한을 강하게 하여,<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처가 간통죄를 범하거나 치유 가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거나 반역죄에 연루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남편이 처를 내쫓거나 처가 남편에게 강제하여 이혼문서를 받아내는 등 사사롭게 이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러한 행위가 알려질 경우에 국가에서는 이를 강력히 처벌하였는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때 남편과 처에게 적용되는 형벌은 그 내용을 달리하였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우선 남편이 처를 합당한 이유 없이 내쫓는 경우는,<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주로 첩을 두고 처를 내쫓아 소박하는 경우와 재혼하기 위하여 처를 내쫓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때 국가에서는 각각 《대명률》호율(戶律)<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혼인조(婚姻條)의 ‘처첩실서(妻妾失序)’ 율과 ‘출처(出妻)’율에 적용시켜 장형의 형벌을 부과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도록 강제하였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혼인관계를 본래대로 회복하는 행위에 대하여《대명률》에서는 ‘병개정(竝改正)’,<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추환완취(追還完聚)’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조선시대에는 다시 합하게 한다 는 의미에서 주로 ‘복합(復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148)</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반면 처가 남편에게 강제하여 불법적으로 이혼문서를 받아내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율이 없다 하여《대명률》의 ‘잡범부응위(雜犯不應爲)’ 율에 적용시켜 장형의 형벌만을 부과하였으나149),<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때는 남편 측의 불법적 이혼과 달리 부합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와 같이 동일한 불법적 이혼인데도 남편과 처에 대한 처벌내용을 달리한 것은 처의 정조를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서 일단 남편을 버리고 떠난 처의 행위를 실절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93, 193, 193);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48)</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첩을 두고 이유 없이 처를 내쫓아 형벌의 부과와 함께 부합명령을 받은 예로는 司直 李中位(《세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3,</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세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월 기미),</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副司正 洪綬(《세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0,</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세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5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6월 을축),</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別侍衛 鄭大 禧(《세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8,</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세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2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4월 경술)</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등의 사례를 들 수 있고,</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처를 버리고 재혼하여 부합명령을 받은 예로는 護軍 金士信(《세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9,</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세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5년 정월 병오),</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前判官 全義(《세종실록》 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9,</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세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5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월 정유),</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成均司成 李&#25929;(《세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9,</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세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7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7월 갑술)</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49)</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雜犯不應爲”율의 내용은 “凡不應得爲而爲之者笞四十 謂律令無條理不可爲者 事理重者杖八十”(《大明 律》刑律 雜犯 不應爲)인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이중 “事理重者”에 해당시켜 장</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80의 형을 부과하였다(《세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3,</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세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8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9월 신축).</span></p></div><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앞장에서 살펴본 한세보의 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최희의 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강복의 처 등과 같이 협의이혼을 위장하기 위하여 강제로 남편에게 이혼문서를 받아낸 행위에 대해 불법적 이혼으로 취급하였으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부합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장형의 형벌만을 부과하였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다만 장인이 사위에게 강요하여 이혼문서를 쓰게 한 참봉 김자균(金自均)<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처의 경우만이 예외적으로 형벌 없이 부합의 조처만을 취하고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는 이혼문서를 강제한 것이 처가 아닌 장인이었을 뿐 아니라,<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장인이 이혼문서를 강제한 것도 자신의 딸과 반목하는 사위에 대한 시위행위로서의 성격을 짙게 띠었기 때문이었다.150)</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부합명령은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을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국가의 부합명령을 따르지 않아 장죄(杖罪)가 추가로 부과된 성균사성(成均司成)<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미(李&#25929;)의 사례가 한 건 나타나기는 하지 만,151)<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여타의 경우에는 부합 여부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지 않아 부합명령의 이행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러나 세종<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25년,<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우의정 신개(申槪)가 “지금 기처한 사람을 논죄하는 것을 보면 강제로 부합시키는 경우가 심히 많지만 어느 한 사람도 부합하여 동거하는 자가 없습니다”152)라고 하며 부합명령이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합명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부합명령을 철저히 관철한 의사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예종 원년에 자식이 있는 처를 이유 없이 내쫓은 김중륜(金仲倫)의 사안을 검토하면서 조석문(曹錫文)이 “전일에 기처한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부합하게 하였으나 부합한 자는 적었습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지금 중륜(仲倫)이 이미 기별(棄別)하였는데 비록 부합하게 한다 하더라도 필시 처음과 같지는 못할 것이니,<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비록<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죄지은 것이)<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사면 이전이기는 하나 죄를 주시기 바랍니다”라 하며 지켜지지 않는 부합명령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유 이전의 일이라도 형을 집행할 것을 청하고 있는 것153)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결국 부합명령은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고,<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부합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국가 에서도 이를 철저히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니,<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부부를 국가에서 강제로 부합시킨다고 하여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문종 원년,<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김자옹(金自雍)이 기첩 옥생향(玉生香)을 속신(贖身)시키고 적처를 내쫓자 사헌부에서 정처와 부합시키고 옥생향은 본역으로 돌려보내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집의(執義)<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신숙주(申叔舟)가 “비록 본처와 부합하게 한다 하더라도 필시 화호(和好)하지 못할 것이니 옥생향을 이이(離異)시켜 본역으로 돌려보내기를 청합니다”154)라 하며 기첩 옥생향을 본역으로 돌려보낼 것만 건의하였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93, 193, 193);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50)《성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성종 즉위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2월 경신. </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51)《세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9,</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세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7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1월 신해. </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52)《세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00,</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세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5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4월 갑인. </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53)《예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예종 원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6월 계해. </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54)《문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문종 원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월 경인.</span></p></div><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렇게 불법적 이혼에 대한 국가의 부합명령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게 되자,<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성종대에 국가의 묵인 하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적 이혼을 차라리 양성화시키자는 건의가 나오기도 하였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즉,<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꼭 처를 버릴 마음이 없는데도 처를 소박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혼을 가장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본처와 영영 헤어지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공식적인 이혼절차를 마련하여 불가피하게 처를 버려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이혼하게 하자는 대사간 安瑚의 건의가 그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러나 금슬이 나쁜 부부를 강제로 화합시킬 수 없고,<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처를 소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를 소박한 죄로 징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영사(領事)<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윤필상(尹弼商)의 반론에 의해 이러한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155)</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위의 조처에서,<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제까지 국가에서 취했던 부합명령의 타당성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는 사사로운 부부관계에 국가가 간여하려는 정책자체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건국 초에 불법적으로 처를 유기할 경우에 국가에서 강제로 이들을 부합시키려는 조처를 취하기도 하였지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성종조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거나 관직만을 삭탈할 뿐 부합시키려는 노력조차 포기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라 보인다.156)</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결국 이혼을 극도로 제한하려 했던 조선시대의 이혼제한정책은 처가 부당하게 이혼 당 하는 피해를 줄여 처로서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공헌하기도 하였으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다른 한편 불법적 이혼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림받은 여성들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데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이는 조선시대 이혼제한 정책의 목표가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시키려는데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인 혼인관계의 유지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전술한 바 인조년간 피로여성과의 이혼을 강력하게 금지하려는 국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혼요청이 허락되지 않았던 장선징에 관한 기사가 실린 말미에 “이후로 사대부 집안의 자제는 모두 다시 혼인하고,<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도로 합하는 자가 없었다”는 내용의 사관의 평이 실렸던 것도,<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국가의 이혼제한정책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93, 193, 193);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55)《성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25,</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성종</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0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월 신해. </span></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font-size: 8pt;">15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부합명령 없이 처벌만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중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73, 28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2월 신묘;</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종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인종 원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3월 무진;《선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7,</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선조</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16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4월 병인;《영조실록》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6,</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영조 원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tyle="font-size: 8pt;">&nbsp;</span><span style="font-size: 8pt;">6월 무인</span>.</p></div><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nbsp;<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공식적인 이혼절차를 마련하자는 건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혼제한 정책을 고수하였던 것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재가규제규정을 설치하고 있는 조선사회에서 이혼녀가 양산될 경우 야기될 사회문제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이혼이란 가문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으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더 나아가서는 조선사회가 추구하는 성리학적 의리의 구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nbsp;</span>문중의식과 성리학적 의리관이 강고해지는 중기 이후에 이혼의 제한이 더욱 철저해졌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nbsp;</p><p style="font: 12px/1.8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trong><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joseon500/Ucfp/7" target="_top">(④편으로 이어짐)</a></strong> ☜</p>
<!-- -->
카페 게시글
사회/계급/노비
조선시대 이혼에 대한 규제와 그 실상 ③
놀새
추천 1
조회 43
15.02.22 10:5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