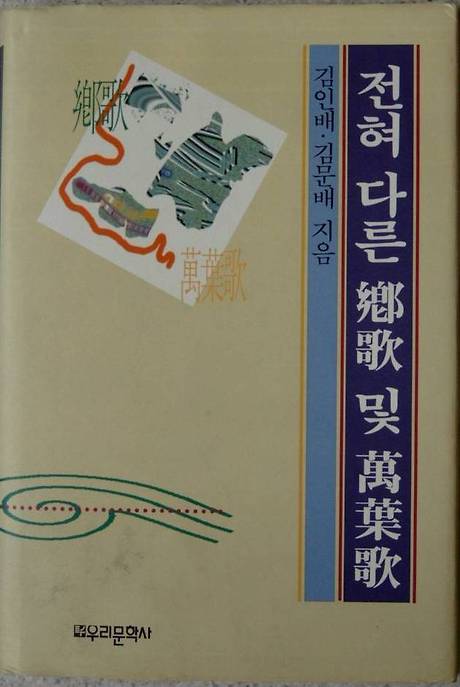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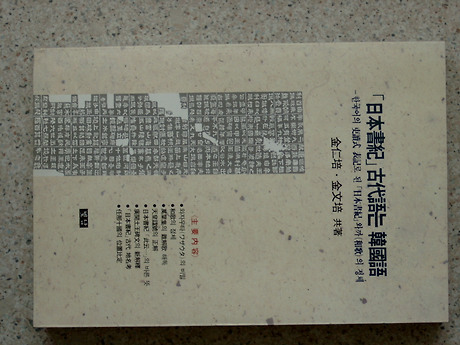
(제망매가)의 새로운 풀이 (김문배,김인배 학설)
-원문- 1)生(목숨)死(다해)路(고달른)隱(숨을)此(그츠술)矣(의) 2)有(가지)阿(마룻대)米(몌)次(사맟)朕(힐)伊(이)遣(보내)吾(우리) 3)隱(숨을) 去(거)內(들이)如(니라) 辭(사)叱(즐)都(모다) 毛(털)如(니라) 4) 云(니를)遣(보내)內(들이)尼(니)叱(즐)古(고)於(오흡다) 5)內(들이) 秋(가슬)察(살피) 早(이르)隱(숨을)風(바람)未(미) 此(그츠술)矣(의) 6) 彼(자축겇)矣(의)浮(뜰)良(어딜)落(비르서)尸(시) 葉(섭)如(니라) 7)一(한나)等(튼)隱(숨을) 枝(남기갗)良(어딜) 出(낳)古(고) 8)去(거)奴(딸아또)隱(숨을) 處(곳)毛(털)冬(겨슬)乎(호) 9)丁(세) 阿(마룻대)也(야) 彌(오래)陀(타)刹뎔)良(어딜)逢(맛볼)乎(호) 吾(우리) 10)道(길) 修(닦아)良(어딜) 待(대)是(옳)古(고)如(니라)
현대어 통역 1)목숨 다해 고달픈 숨을 그쳤으므로 2)가지 마라 할 때 뫼 쌓 묻힐 이 보내오리 3)숨을 거두리니라서 절(寺) 모여들리라 4)너를 보내었더니 (아무것도) 잊을 게 없다 5)들어가 잘 (곳) 살피러 숨는 바람이 그쳤으니 6)저 쪽 끝에 떨어질 비(雨)로써 (슬픔을) 씻었니라 7) 한 낱의 목숨은 남겨져 (뒤에) 놓아두고 8)(가버린) 그 딸아 또 숨은 곳을 (찾아) 곁으로 9)풀(새:草) 마를 때야 오라 했다. 떨어질 맞보러 우리(헤어질 우리 만나보러) 10) 길 닦여지길 기다려올 것이니라
<재망매가를 새로이 해독한 위의 내용을 보건대 누이의 죽음을 제재로 육친에 대한 그리움과 구원의 세계를 나타낸 시라는 점에서는 기존 해석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 표현된 구체적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르며,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론적 깨달음 역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존 해석에 따라 이 노래를 이해하게 되면, 누이의 죽음에 마주선 괴로운 심경을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체념과 넘쳐흐르는 골육의 정으로 노래한 것쯤으로 설명된다.
특히 가을 바람에 지는 나뭇잎으로 비유된 모든 생명체의 무상성(無常性), 거기다가 '이른바람'이라고 함으로써 젊은 나이로 죽어간 누이의 삶의 덧없음이 강조되면서 '가는 곳 모르온저'라고 비탄에 찬 영탄을 함으로써 죽음의 삭막함에 대한 뼈아픈 비애를 드러낸 노래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월명사의 면모가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원리를 평소엔 전혀 체득하지 못하고 살아온 한낱 속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승려다운 탈속의 풍모는 티끌만큼도 없고 고작 누이의 죽음이라는 불의의 사태에 직면하자 겨우 마지막 대목에서 불교적인 내세관에 의해 이런 공포와 허무, 그리고 비애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자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치 이제 막 출가(出家)하여 불문(佛門)에 들려는 자기 누이의 죽음에 부치는 전언(傳言)의 내용을 띄우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요컨대, 이 노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새로운 풀이에 의해 드러난 이 노래 내용의 요지를 간략히 소개한다.
이승을 건너 저쪽 미지의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가 무덤이고, 무덤은 곧 죽음이며 그 너머에 서방정토가 있다는 의식,
그러므로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거기로 도달할 수 있다는 이 한계성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다는 존재론적 깨달음을 가능케 해준다.
대략 이런 불교적 인식 밑에 불려진 노래이다.
또, 표현 형식에 대해 말하자면 이 노래가 10구체의 향가에 속하고 대부분의 10구체 향가가 그러하듯이 노래의 시상(詩想)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해왔다.
그러나 10구체니 8구체니4구체니하는 견해도 종전의 해독법에 따라 설정된 것에 불과하고,또 10구체 향가가 세 단락으로 구분된다는 견해 역시 확고히 밝혀져 정설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필자가 이 노래의 내용에 따라 새로이 단락별로 구분하고, 각기 그 표현상의 특징이나 중요한 의미 등을 살펴, 이른바 [시적표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따라서 이 시가는 모두 세 단락 여섯 부절로 짜여 있다(3구6명). 첫째 단락은 1행 부터 4행까지이며,
그 전부절(1~2행)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목숨이 다하여 이승의 고달픈 숨을 그치면 떠나지 말라고 아무리 만류하고 싶을 때라도 무덤만이 이승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죽음의 피할 수 없는 숙명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누이도 그처럼 묏 쌓아 묻힐 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순순히 보내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가지 마라 할 때 뫼 쌓 묻힐이 보내우리]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선 하잘것 없는 존재이며,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삶의 본질적 모습에서 너무도 일찍 떠난 누이의 죽음 인간 모두에게 두루 해당하는 본질적 한계라는 점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순순히 떠나보내는 종교적 달관의 경지가 이미 이 첫 대목에서부터 제시 되고 있다.
첫째 단락의 후부절은 3~4행까지이며, 이 문맥에서는 숨을 거둔 누이를 위해 절에 모여든 신도들과 더불어 극락왕생을 비는 재를 올린 것이 이야기되 있고,
이처럼 너를 보내는 이승의 마지막 의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잊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함으로써 이승과 맺어진 인연의 끈이 얼마나 끈끈한가를 암시적으로 전하고 있다.
돌째 단락은 5~6행까지이며, 여기서는 이 노래의 배경 설화와 연관되어 있다. 즉 [죽은 누이를 위하여 재를 올리며 향가를 지어 제사할 적에 홀연히 광풍이 일어 지전(紙錢)을 날려 서쪽으로 사라졌다] 했는데
극락 가는 노자돈으로 삼은 지전이 바람에 날려 서쪽으로 사라졌다는 것은 곧 망매가 서방정토로 갔음을 은연중 희구하고 또한 확신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들어가 잘 곳 살피러 숨을 바람이 그쳤으므로, 저쪽 끝에 떨어질 비(雨)로써 씻었니라]의 절묘한 시적 표현을 빌려 이곳이 아닌 다른 곳,
즉 현실 [저쪽 끝의]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이 노래의 배경 설화와 더불어 구체성을 띄는 대목이다. [저쪽 끝]으로 표현된 누이가 가버린 저승,
망자가 들어가 잠들 곳을 살피러 바람마저 숨어버리는 고요한 그 세계와는 달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람 불고 비가 내리는 현실 세계라는 이질감과 거리감을 절실히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도 현실의 [저쪽 끝], 그 초월적인 정토 의식의 설정을 통하여 슬픔을 승화시킴으로써 시적 자아의 정서가 속된 센티멘틀리즘에 떨어지지 않고 교묘히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말하면,지극한 슬픔을 지니면서도 그것을 조용히 안으로 씻어내리듯 내면의 평형 상태를 다스릴 수 있는 데는 이곳이 아닌 다른곳, 즉 현실 저쪽 끝에 대한 인식이 이승의 삶 자체에 본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엔 다분히 불교적인 정토 사상이 깔려 있다. 셋째 단락은 7~10행까지이며,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 가장 긴 문맥으로 짜여져 있다. 누이의 육신이 묻힌 무덤의 떼(풀)가 마를 때, 즉 보이는 것마다 모두 메말라 삭막해진 다음에야 갈 수 있는 곳으로 설정된 극락정토,
누이가 이승으로부터 숨어버린 그곳 곁으로가자면 모든 인간적 애상(哀傷)이나 사랑 혹은 연민의 감정이 저 무덤의 풀처럼 말라버린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 점은 불교적 세계관과 밀접한 것인 동시에 노자의 오랜 동양적 사고와도 무관하지 않다.
"사람이 갓 났을 때는 유약하지만, 죽어서는 단단하게 된다. 초목도 갓 자랄 때는 부드럽지만 죽을 때는 말라서 굳게 된다.
고로 억세고 굳은 것은 죽음의 무리이며,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노자,76장)
[풀 마를 때]로써 상징된 죽음의 상황이 현실의 저쪽 끝에 있으매, 이 현실에 남겨진 나의 목숨을 [한낱(一箇)은]이라는 홀수로써 표현한 그 고독감의 정황을 객체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현실의 그 [저쪽 끝]에 머물러 있는 순수한 시선에 의해 거꾸로 이곳을 되돌아보고 있개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세속적 삶의 본질을 들여다본 뒤에 깨닫는 것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괴롭더라도 이곳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은 늘 막혀 있다는 사실,
또 그 길은 현실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므로 죽음이라는 통과제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열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란 것을 아울러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의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 우리가 만나보러 [길] 닦아질 때를 기다려올 것이라고 독백함으로써 존재의 내부로 향하고 있던 시선을 자신의 내부로 옮겨가고 있다.
[길 닦아질때]란 것은 곧 [도(道)의 수행]임을 암시한 것에 다름아니며,육신의 죽음을 통한 딴 곳으로의 이행이 정서적 차원에서는 결별이지만 관념적 또는 구도적 차원에서는 차라리 구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혀다른 향가 및 만엽가 120페이지/1993년 우리문학사>글돋선생010-9665-2274 ID :kmb2274@hanmail.net |
출처: 전혀 다른 향가 및 만엽가 원문보기 글쓴이: 庭光散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