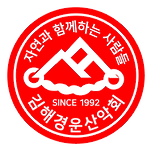<P><SPAN style="FONT-FAMILY: Dotum"><FONT size=4></FONT></SPAN>&nbsp;</P>
<P><SPAN style="FONT-FAMILY: Dotum"><FONT color=#8c3c04 size=5><STRONG>[고사성어]</STRONG><FONT color=#000000 size=7>克己復禮</FONT><STRONG>(극기복례)</STRONG></FONT></SPAN></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nbsp;</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nbsp;</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TRONG>[字解]</STRONG></SPAN></FONT></P>
<P><FONT color=black><SPAN style="FONT-FAMILY: Dotum"><A class=hanb6 href="http://hanja.naver.com/hanja.naver?where=brow_hanja&amp;id=8431"><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克 : 이길 극, ㉠이기다 ㉡능하다 ㉢메다 ㉣그램 ㉤승벽(지기 싫어하는 성질)')"><U><FONT color=#c8056a size=4>克</FONT></U></SPAN></A><!--<a href=# class="han6">--><FONT size=4><SPAN class=gr-nu01> 이길 극</SPAN><!--</a> --><BR></FONT><A class=hanb6 href="http://hanja.naver.com/hanja.naver?where=brow_hanja&amp;id=8494"><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己 : 몸 기, ㉠몸 ㉡자기 ㉢여섯째 천간 ㉣다스리다')"><U><FONT color=#c8056a size=4>己</FONT></U></SPAN></A><!--<a href=# class="han6">--><FONT size=4><SPAN class=gr-nu01>&nbsp;자기 기</SPAN><!--</a> --><BR></FONT><A class=hanb6 href="http://hanja.naver.com/hanja.naver?where=brow_hanja&amp;id=9576"><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復 : 돌아올 복, 다시 부, ㉠돌아오다 ㉡돌아가다 ㉢회복하다 ㉣고하다 ㉤대답하다 ㉥갚다 ㉦되풀이하다 ⓐ다시 (부)')"><U><FONT color=#c8056a size=4>復</FONT></U></SPAN></A><!--<a href=# class="han6">--><FONT size=4><SPAN class=gr-nu01>&nbsp;돌아올 복</SPAN><!--</a> --><BR></FONT><A class=hanb6 href="http://hanja.naver.com/hanja.naver?where=brow_hanja&amp;id=9034"><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禮 : 예도 례(예), ㉠예도 ㉡예 ㉢절 ㉣인사 ㉤예물 ㉥책 이름(예기) ㉦예우하다')"><U><FONT color=#c8056a size=4>禮</FONT></U></SPAN></A><!--<a href=# class="han6">--><SPAN class=gr-nu01><FONT size=4> 예도 례(예)</FONT></SPAN></SPAN></FONT></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nbsp;</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TRONG>[意義]</STRONG></SPAN></FONT></P>
<P><FONT color=black><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FONT size=4><FONT color=#000080><SPAN style="FONT-FAMILY: Dotum">사리사욕을 억제(抑制)하고 예(禮)로 돌아감</SPAN></FONT><FONT color=black><SPAN style="FONT-FAMILY: Dotum">을 뜻한다.</SPAN></FONT></FONT></P>
<P><FONT size=4><FONT color=black><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FONT>&nbsp;</P>
<P><FONT size=4><FONT color=black><SPAN style="FONT-FAMILY: Dotum"><STRONG>[出典]</STRONG></SPAN></FONT></FONT></P>
<P><FONT size=4><FONT color=black><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FONT><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논어(論語) 제12 안연(顔淵)</SPAN></FONT></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nbsp;</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TRONG>[解義]</STRONG></SPAN></FONT></P>
<P><FONT color=black><SPAN style="FONT-FAMILY: Dotum"><FONT size=4>자기의 욕망ㆍ감정을 이겨내고 사회적 법칙인 예를 따르다. </FONT></SPAN></FONT></P>
<P><FONT color=black><SPAN style="FONT-FAMILY: Dotum"><FONT size=4>논어(<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논 : 논의할 논(론), ㉠논의하다, 말하다 ㉡서술하다 ㉢견해 ㉣의견 ㉤학설 ㉥문체의 이름 ㉦조리(=倫) (륜)')">論</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어 : 말씀 어, ㉠말씀 ㉡소리 ㉢말하다 ㉣알리다')">語</SPAN>)에는 인(<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인 : 어질 인, ㉠어질다 ㉡인자하다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어진 이 ㉥자네 ㉦씨')">仁</SPAN>)에 관한 언급이 매우 많다. 이유는 </FONT><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6689"><FONT color=#096ab5 size=4><U>공자</U></FONT></A><FONT size=4>의 대표적 사상이 인이었기 때문이며, ‘극기복례’도 그 인의 정의의 하나이다.</FONT></SPAN></FONT></P>
<P><FONT color=black><SPAN style="FONT-FAMILY: Dotum"><FONT size=4>《논어》에는, ‘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누가 인한가? 모든 사람이 인 때문에 살면서 인을 모르고 인을 외면한다’고 하였으며, ‘인 좋아하기를 색 좋아하듯 한다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도 하였다. </FONT></SPAN></FONT></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nbsp;</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
<P>논어〈안연(<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안 : 얼굴 안, ㉠얼굴 ㉡안면 ㉢표정 ㉣면목 ㉤체면 ㉥이마 ㉦빛 ㉧색채')">顔</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연 : 못 연, ㉠못 ㉡웅덩이 ㉢소 ㉣깊다 ㉤조용하다')">淵</SPAN>)〉편에, 안연이 인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감이 인이 된다[<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안 : 얼굴 안, ㉠얼굴 ㉡안면 ㉢표정 ㉣면목 ㉤체면 ㉥이마 ㉦빛 ㉧색채')">顔</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연 : 못 연, ㉠못 ㉡웅덩이 ㉢소 ㉣깊다 ㉤조용하다')">淵</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문 : 물을 문, ㉠묻다 ㉡문초하다 ㉢방문하다 ㉣찾다 ㉤알리다 ㉥부르다 ㉦소식 ㉧물음')">問</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인 : 어질 인, ㉠어질다 ㉡인자하다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어진 이 ㉥자네 ㉦씨')">仁</SPAN> <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자 : 아들 자, ㉠아들 ㉡첫째지지 ㉢알 ㉣씨 ㉤당신 ㉥경칭 ㉦접미사 ㉧사람')">子</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왈 : 가로 왈, ㉠가로되 ㉡이르다')">曰</SPAN><FONT color=#c84205><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극 : 이길 극, ㉠이기다 ㉡능하다 ㉢메다 ㉣그램 ㉤승벽(지기 싫어하는 성질)')">克</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기 : 몸 기, ㉠몸 ㉡자기 ㉢여섯째 천간 ㉣다스리다')">己</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복 : 돌아올 복, 다시 부, ㉠돌아오다 ㉡돌아가다 ㉢회복하다 ㉣고하다 ㉤대답하다 ㉥갚다 ㉦되풀이하다 ⓐ다시 (부)')">復</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례 : 예도 례(예), ㉠예도 ㉡예 ㉢절 ㉣인사 ㉤예물 ㉥책 이름(예기) ㉦예우하다')">禮</SPAN></FONT><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위 : 할 위, ㉠하다 ㉡행위 ㉢위하다 ㉣되다 ㉤생각하다 ㉥삼다 ㉦배우다 ㉧가장하다')">爲</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인 : 어질 인, ㉠어질다 ㉡인자하다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어진 이 ㉥자네 ㉦씨')">仁</SPAN>(안연문인 자왈극기복례위인)]. 하루라도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일 : 하나 일, ㉠하나 ㉡첫째 ㉢오로지 ㉣만일 ㉤혹시 ㉥어느 ㉦번 ㉧같다')">一</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일 : 날 일, ㉠날 ㉡해 ㉢낮 ㉣나날이 ㉤접때')">日</SPAN><FONT color=#c84205><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극 : 이길 극, ㉠이기다 ㉡능하다 ㉢메다 ㉣그램 ㉤승벽(지기 싫어하는 성질)')">克</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기 : 몸 기, ㉠몸 ㉡자기 ㉢여섯째 천간 ㉣다스리다')">己</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복 : 돌아올 복, 다시 부, ㉠돌아오다 ㉡돌아가다 ㉢회복하다 ㉣고하다 ㉤대답하다 ㉥갚다 ㉦되풀이하다 ⓐ다시 (부)')">復</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례 : 예도 례(예), ㉠예도 ㉡예 ㉢절 ㉣인사 ㉤예물 ㉥책 이름(예기) ㉦예우하다')">禮</SPAN></FONT> <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천 : 하늘 천, ㉠하늘 ㉡하느님 ㉢자연 ㉣임금 ㉤천자')">天</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하 : 아래 하, ㉠아래 ㉡밑 ㉢뒤 ㉣낮추다 ㉤내리다 ㉥물리치다 ㉦떨어지다 ㉧손대다 ㉨임금 ㉩귀인의 거처 ㉪아랫사람')">下</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귀 : 돌아갈 귀, ㉠돌아가다 ㉡돌아오다 ㉢따르다 ㉣붙좇다 ㉤맡기다 ㉥마치다 ㉦시집가다 ㉧편들다 ㉨뜻')">歸</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인 : 어질 인, ㉠어질다 ㉡인자하다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어진 이 ㉥자네 ㉦씨')">仁</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언 : 어찌 언, ㉠어찌 ㉡어조사 ㉢형용어사')">焉</SPAN>(일일극기복례 천하귀인언)].’ 인을 행함은 자기를 말미암은 것이니 <FONT color=#000000>다른 사람</FONT>에게 말미암겠는가[(<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위 : 할 위, ㉠하다 ㉡행위 ㉢위하다 ㉣되다 ㉤생각하다 ㉥삼다 ㉦배우다 ㉧가장하다')">爲</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인 : 어질 인, ㉠어질다 ㉡인자하다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어진 이 ㉥자네 ㉦씨')">仁</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유 : 말미암을 유, ㉠말미암다 ㉡까닭 ㉢부터 ㉣쓰다 ㉤행하다')">由</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기 : 몸 기, ㉠몸 ㉡자기 ㉢여섯째 천간 ㉣다스리다')">己</SPAN> <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이 : 말이을 이, ㉠말 잇다 ㉡너 ㉢뿐 ㉣어조사 ㉤같다')">而</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유 : 말미암을 유, ㉠말미암다 ㉡까닭 ㉢부터 ㉣쓰다 ㉤행하다')">由</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인 : 사람 인, ㉠사람 ㉡남 ㉢딴 사람 ㉣백성 ㉤인품 ㉥인격')">人</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호 : 어조사 호, ㉠어조사 ㉡감탄사 ㉢그런가')">乎</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재 : 어조사 재, ㉠어조사 ㉡비롯하다')">哉</SPAN>:위인유기 이유인호재)]. </P>
<P>&nbsp;</P>
<P>안연이 그 조목(<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조 : 가지 조, ㉠가지 ㉡조리 ㉢맥락 ㉣조목 ㉤끈 ㉥법규 ㉦유자나무 ㉧통하다 ㉨길다')">條</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목 : 눈 목, ㉠눈 ㉡보다 ㉢조목 ㉣이름 ㉤요점 ㉥우두머리 ㉦제목')">目</SPAN>)을 여쭈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예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듣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자 : 아들 자, ㉠아들 ㉡첫째지지 ㉢알 ㉣씨 ㉤당신 ㉥경칭 ㉦접미사 ㉧사람')">子</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왈 : 가로 왈, ㉠가로되 ㉡이르다')">曰</SPAN> <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비 : 아닐 비, ㉠아니다 ㉡그르다 ㉢나무라다 ㉣어긋나다 ㉤헐뜯다 ㉥나무라다')">非</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례 : 예도 례(예), ㉠예도 ㉡예 ㉢절 ㉣인사 ㉤예물 ㉥책 이름(예기) ㉦예우하다')">禮</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물 : 말 물, 털 몰, ㉠말다(금지의 조사) ㉡없다 ㉢아니다 ⓐ털다 (몰)')">勿</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시 : 볼 시, ㉠보다 ㉡살피다')">視</SPAN> <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비 : 아닐 비, ㉠아니다 ㉡그르다 ㉢나무라다 ㉣어긋나다 ㉤헐뜯다 ㉥나무라다')">非</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례 : 예도 례(예), ㉠예도 ㉡예 ㉢절 ㉣인사 ㉤예물 ㉥책 이름(예기) ㉦예우하다')">禮</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물 : 말 물, 털 몰, ㉠말다(금지의 조사) ㉡없다 ㉢아니다 ⓐ털다 (몰)')">勿</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청 : 들을 청, ㉠듣다 ㉡들어 주다 ㉢판결하다 ㉣기다리다 ㉤마을 ㉥염탐꾼')">聽</SPAN> <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비 : 아닐 비, ㉠아니다 ㉡그르다 ㉢나무라다 ㉣어긋나다 ㉤헐뜯다 ㉥나무라다')">非</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례 : 예도 례(예), ㉠예도 ㉡예 ㉢절 ㉣인사 ㉤예물 ㉥책 이름(예기) ㉦예우하다')">禮</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물 : 말 물, 털 몰, ㉠말다(금지의 조사) ㉡없다 ㉢아니다 ⓐ털다 (몰)')">勿</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언 : 말씀 언, 화기애애할 은, ㉠말씀, 말 ㉡말하다 ㉢여쭈다 ㉣높다 ⓐ화기애애하다 (은)')">言</SPAN> <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비 : 아닐 비, ㉠아니다 ㉡그르다 ㉢나무라다 ㉣어긋나다 ㉤헐뜯다 ㉥나무라다')">非</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례 : 예도 례(예), ㉠예도 ㉡예 ㉢절 ㉣인사 ㉤예물 ㉥책 이름(예기) ㉦예우하다')">禮</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물 : 말 물, 털 몰, ㉠말다(금지의 조사) ㉡없다 ㉢아니다 ⓐ털다 (몰)')">勿</SPAN><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동 : 움직일 동, ㉠움직이다 ㉡옮기다 ㉢흔들리다 ㉣동요하다 ㉤떨리다 ㉥느끼다 ㉦감응하다 ㉧일하다 ㉨변하다 ㉩일어나다 ㉪시작하다 ㉫나오다 ㉬나타나다 ㉭어지럽다')">動</SPAN>(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P>
<P>&nbsp;</P>
<P>여기서 ‘<A href="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2g4021a" target=dic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return gLink(this, "DITO", "1", "2")'><U><FONT color=#800080><FONT color=#0686a8 size=4>극기복례</FONT>&nbsp;</FONT></U></A>’가 유래되었으며, 공자의 많은 제자들이 이 인에 대해 질문을 하여 왔지만 그때마다 공자는 각각 그들의 정도에 따라 다른 대답을 하였다. <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4212"><FONT color=#096ab5 size=4><U>수제자</U></FONT></A> 안연에게 대답한 ‘극기복례’가 인의 정의의 최고 경지라 할 수 있으며, 이 장은《논어》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유명한 장으로 예(<SPA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ooltip_of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ooltip_on('','예 : 예도 예(례), ㉠예도, 예 ㉡절 ㉢인사 ㉣예물 ㉤책 이름(예기) ㉥예우하다')">禮</SPAN>)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극기는 마음의 욕망과의 싸움보다는 극기주의(<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27697"><FONT color=#096ab5 size=4><U>금욕주의</U></FONT></A>), 극기운동 등 육체적 훈련과정을 지칭하는 경우에 많이 쓰고 있다.</SPAN></FONT></P>
<P><FONT size=4><FONT color=black><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FONT>&nbsp;</P>
<P><FONT size=4><FONT color=black><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FONT><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즉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억제하고 남의 이익과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 주어야 함을 말한다. </SPAN></FONT></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특히 위정자(爲政者)가 이러할 경우, 국민들이 이를 따라 인(仁)을 지향하게 된다는 뜻이다.</SPAN></FONT></P>
<P><FONT color=navy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nbsp;</P>
<P><STRONG><FONT color=navy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English]</SPAN></FONT></STRONG></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FONT color=#000000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To subdue one's self and return to propriety.[극기복례(克己復禮)]</SPAN></FONT></P>
<P><FONT color=#000000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To comply with the rites by setting restraints on oneself.</SPAN></FONT></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nbsp;[</SPAN></FONT><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자신을 속박(束縛)함으로써 관례(慣例)에 따르다]</SPAN></FONT></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nbsp;</SPAN></FONT><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 comply: 응하다, 따르다 &nbsp;rite: 의식(儀式), 관례 &nbsp;restraint: 억제(抑制), 속박</SPAN></FONT></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elf-restraint and restoration to the rites.[</SPAN></FONT><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자기 속박과 관례의 회복(回復)]</SPAN></FONT></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nbsp;</SPAN></FONT><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 self-restraint: 자기 억제, &nbsp;restoration: 회복, 복구(復舊)</SPAN></FONT></P>
<P><FONT color=black size=4><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FONT>&nbsp;</P>
<P><FONT color=#610334 size=3><SPAN style="FONT-FAMILY: Dotum"><STRONG>출처:풀어쓴 중국고전.NAVER백과사전.</STRONG></SPAN></FONT></P>
<!-- -->
카페 게시글
◈교양한문
고사성어
克己復禮(극기복례)
경운산
추천 0
조회 100
08.01.19 14:2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