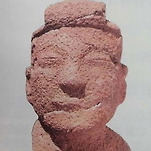<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lt;득안성&gt; </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백제는 전국을 다섯으로 나눈 최고의 지방 통치조직으로 東部&#183;西部&#183;南部&#183;北部&#183;中部를 말한다. 五方과 같은 것이다. 백제 말기에 와서 方과 部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部는 광역의 행정구역 겸 軍管區로서 6~10개의 郡을 포괄하였고, 또 小城으로 표현되는 縣들을 統屬하고 있었다. 部(方)의 장은 方領이라고 하였으며 달솔의 관등소지자가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五部의 中心治所는 方城이라고 하였는데 《周書》 권49 열전 백제전, 《北史》 권94 열전 백제전 및 《翰苑》 백제조에 인용된 《括地志》에 의해 方과 方城의 명칭을 보면 다음과 같다. <span style="color: rgb(255, 0, 0);">中方-古沙城, 東方-</span><span class="key_highlight" style="color: rgb(255, 0, 0);">得安</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城, 南方-久知下城(卞城), 西方-刀先城(力先城), 北方-熊津城(固麻城). </span>이 방성은 대개가 험한 산에 의지하여 돌로 쌓았으며, 1200~700명 정도의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strong>&lt;북사&gt; 열전 백제전</strong> </span></p><p><br></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p>○ 其都曰居拔城, 亦曰固麻城.<span class="lyrPopup" id="jo_012_f046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46 其都曰居拔城 亦曰固麻城</strong><span class="lyrpop_cont">이는 固麻城이 居拔城과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記事인데, 『周書』百濟傳 以來의 기사를 답습하여 固麻城이 곧 熊津城이라는 것을 인식치 못한 데서 나온 소산이라고 본 견해가 있다(李弘稙, 「梁職貢圖論考」pp.404~405).<br>&#65308;참조&#65310;<br> 『周書』百濟傳 註 7)<br>固麻城<br> 熊津은 ‘곰나루’의 漢字譯이며 지금의 公州이다.<br>『日本書紀』「雄略天皇紀」21年 春3月條에는 文周王이 國都를 熊川(公州)으로 옮긴 데 대하여 ‘天皇聞百濟爲高麗所破 以久麻那利賜汶州王救興其國’이라 하였는데, ‘久麻那利’는 熊川의 古名 古麻城 또는 ‘固麻那禮(利)’이다.<br>‘北方은 熊津城이다’라는 구절과 관련하여 李弘稙은 이 記事는 百濟의 南遷 즉, 熊津都邑時代의 일임이 명료한 사실인데, 『周書』以來의 中國正史에서는 百濟가 扶餘로 南遷한 末期까지의 상태와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梁職貢圖論考」pp.404~405) 즉, 『周書』에서 ‘治固麻城 其外更有五方 …… 北方曰熊津城’이라고 한 것은 부여(所夫里 泗&#27800;: 原註)로 國都를 옮긴 이후 地方을 5方으로 나눈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國都를 여전히 ‘固麻城’이라 하고 5方時代에 北方의 중심을 熊津城으로 삼은 것은 熊津城을 固麻와 別城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隋書』에서는 泗&#27800;城을 ‘其都曰居拔城’이라고 明記하고 있는데, 『北史』에서 ‘其都曰居拔城 亦曰固麻城’이라 하고, 5方 중 ‘北方曰熊津城’이라 한 것은 『周書』以來의 기사를 답습하여 固麻城이 곧 熊津城이라는 것을 인식치 못한 소산이라고 하였다. (앞의 논문, pp.404~405)<br>한편 坂元義種은 『隋書』百濟傳에는 ‘居拔城’이라 되어 있고, 當時의 國都는 泗&#27800;(忠淸南道 扶餘의 地)이므로 固麻城은 大城(王城)을 의미한다고 하였다.(「譯註中國史書百濟傳(周書)」p.268) 여기서 坂元義種의 見解를 따른다면 扶餘로 수도를 옮긴 뒤에도 여전히 泗&#27800;라는 이름 外에 ‘固麻城’이라 불리웠을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마치 현재의 수도인 ‘서울’이 行政區域上의 地名이라는 의미 外에 首都라는 意味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br>≪參考文獻≫<br>『日本書紀』卷 14「雄略天皇紀」21年條.<br>李弘稙, 「梁職貢圖論考」『韓國古代史의 硏究』1971.<br>坂元義種, 「譯註中國史書百濟傳(周書)」『百濟史の硏究』1978.<br> ≪參考文獻≫<br>李弘稙, 「梁職貢圖論考-특히 百濟使臣圖經을 中心으로-」『韓國古代史의 硏究』1971, 新丘文化社.<br></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其外更有五方</p><span class="lyrPopup" id="jo_012_f047_comment" style="display: none;"><p><strong>047 五方</strong></p><span class="lyrpop_cont"><p>이 五方에 대한 記事는 『周書』百濟傳의 기사를 轉錄한 것이다.<br>&#65308;참조&#65310;<br> 『周書』百濟傳 註 8)<br>五方<br>5方과 관련하여 百濟의 地方制度에 대해서 살펴보면, 百濟의 地方行政制度는 王權强化의 核心的인 作業으로서 대체로 聖王의 泗&#27800;遷都와 더불어 정비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확실해진 것은 今西龍의 「百濟五方五部考」 以來 여러 學者들의 硏究에 의해서였다. 今西龍에 의하면 武寧王代에는 ‘五方’의 稱이 없이 ‘22&#27280;魯’制였으나 聖王 27年 경에는 城主制의 ‘五方’으로 되었고, ‘五方’이 완전한 行政區劃으로서의 ‘五部’로 된 것은 義慈王代라고 하였으나, (앞의 논문, pp.283~326) 以後에 그가 쓴 「百濟史講話」에서는 聖明王(聖王)의 初期에 國內의 五方五部制度도 完備되어졌다고 하였다.<br>이러한 地方行政制度의 始源에 대해 金哲埈은 「百濟社會와 그 文化」에서 『三國史記』「百濟本紀」에 의하면 溫祚 31년에 南&#183;北部, 33年에 東&#183;西部를 두어 首都地域까지 합쳐 5部制가 성립되었으며, 이러한 百濟初期의 全國行政區域으로서의 4部制는 泗&#27800;時代의 ‘五方’으로 정비되고, 首都行政區域도 熊津時代부터 支配層勢力을 首都로 집중시켜 支配體制를 强化한 뒤에 ‘五部’로 나누게 되었다고 하였다.<br>한편 千寬宇는 百濟의 地方行政組織이 體系化되는 記錄이 分明치는 않지만, 本格的인 地方行政區劃이 시작되는 것은 近肖古王 8年의 시기라 하였다. 그 방증사료로서 『日本書紀』「仁德天皇紀」41年(353)의 ‘遣紀角宿&#31152;於百濟 始分國郡疆場 具錄鄕土所出’이란 기록을 들고 있다. (「三韓의 國家形成」(上) pp.7~8; 「三韓의 國家形成」(下) pp.121~122) 또 扶餘가 固麻城(公州)으로 混同된 過程을 史料를 摘出하여 綜觀하여, 『梁書』百濟傳에는 ‘號所治城曰固麻 謂邑曰&#27280;魯 如中國之言郡縣也 其國有二十二&#27280;魯 皆以子弟宗族分據也’라 하여 公州- ‘二十二&#27280;魯’時代이고, 『周書』百濟傳에는 ‘治固麻城 其外更有五方 …… 北方曰熊津城’이라 하여 扶餘-‘五方’時代인데도 公州와 扶餘가 混同되고 있고, 『隋書』百濟傳의 ‘其都曰居拔城’이라는 扶餘時代의 기록을 거쳐 『北史』百濟傳에는 ‘其都曰居拔城 亦曰固麻城 其外更有五方 …… ’이라 하여 公州와 扶餘의 混同이 ‘亦曰’로 처리되고 있다고 하고, 『舊唐書』百濟傳의 ‘其王所居有東西兩城 …… 又外置六帶方(六方&#65311;)管十郡’과 『新唐書』百濟傳의 ‘王居東&#183;西二城 …… 方統十郡’에서는 東西兩分說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래의 史書에 보인 兩都의 混同을 文脈上으로 合理化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p.13의 註 15)<br>또한 『周書』&#183;『北史』&#183;『翰苑』所引『括地志』의 王城 및 五方 관계기록을 圖表化하였다.<br></p><table width="100%"><tbody><tr><td>&#65308;百濟 扶餘時代의 王城&#183;五方表&#65310;</td></tr></tbody></table><div class="dl_data_all"><table width="" height=""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nbsp;</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周書』百濟傳</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北史』百濟傳</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翰苑』所引『括地志』</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王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固 麻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俱拔城 亦曰 固麻城 </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王城&#183;居狄城 方一里半 可方(万&#65311;)餘家 - 部有五百人</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中方</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古 沙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古 沙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古沙城 國南二百六十里 方百五十里步 方統 兵千二百人</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東方</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得 安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得 安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得安城 國東南百里 方一里</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南方</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久知下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久 知 下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卞城 國南三百六十里 方一百三十步</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西方</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刀 先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刀 先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力光城 國西三百五十里 方二百步</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北方</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熊 津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熊 津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熊津城 一名固麻城 國東北六十里 方一里半</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參考</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3"> 其國(百濟國)……東西四百五十里 南北九百餘里(『周書』&#183;『北史』百濟傳)</td></tr></tbody></table></div><p>그리고 扶餘의 古號가 『三國史記』에는 ‘所夫里’-‘泗&#27800;’인데 대하여 中國記錄에는 ‘居拔’(『隋書』) &#183; 俱拔(『北史』) &#183; ‘居狄’(『括地志』)으로 되어 있는 것은 百濟語의 二重構造(馬韓系&#183;夫餘系 中 어느 하나일 듯)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p.12)<br> ≪參考文獻≫<br>『梁書』卷54「東夷列傳」百濟條.<br>『周書』卷49「異域列傳」百濟條.<br>『隋書』卷81「東夷列傳」百濟條.<br>『北史』卷94「列傳」百濟條.<br>『舊唐書』卷199上「東夷列傳」百濟國條.<br>『新唐書』卷220「東夷列傳」百濟條.<br>『日本書紀』卷11「仁德天皇紀」41年條.<br>金哲埈, 「百濟社會와 그 文化」『韓國古代社會硏究』1975.<br>李丙燾, 「風納里土城과 百濟時代의 蛇城」『韓國古代史硏究』1976.<br>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三韓攷-」(上&#183;下)『韓國學報』2&#183;3合輯, 1976;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東洋學』9, 1979.<br>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三國時代를 中心으로-」『韓國史論』7, 1981.<br>盧重國, 「漢城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27280;魯體制를 中心으로-」『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1985, 三英社.<br>今西龍, 「百濟五方五部考」『百濟史硏究』1934, 近澤書店.<br>末松保和, 『任那興亡史』1949.<br>山尾幸久, 「朝鮮三國の軍區組織」『古代朝鮮と日本』1974, 龍溪書舍.<br>武田幸男,「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1980.<br></p></span><p><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p></span><p>: 中方曰古沙城,<span class="lyrPopup" id="jo_012_f048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48 古沙城</strong><span class="lyrpop_cont"> 『三國史記』「地理志」古阜郡條에 의하면 古沙城은 지금의 全羅北道 古阜郡이다.<br>&#65308;참조&#65310;<br> 『周書』百濟傳 註 9)<br>古沙城<br> 『三國史記』「地理志」古阜郡條에 ‘古阜郡 本百濟古&#30471;(『東國輿地勝覽』에는 沙)夫里郡 景德王改名 今因之’라 하여 古沙城은 지금의 全羅北道 古阜郡임을 알 수 있다. 丁若鏞은 이에 관하여<br>臣謹按 北史所載 百濟五府其中府曰 古沙城 或似今古阜郡(本古沙夫里) 然彼旣以恩津爲東府 金溝爲南府 則古阜不得爲中府也(『與猶堂全書』「疆域考」八道沿革總&#21465;)<br>라 하였고, 韓鎭書는<br>鎭書謹按 古沙城爲中方城 當是扶餘近地也 或以今古阜縣(本百濟古沙夫里郡) 當之非也 古阜 僻在海濱 不可謂中方城也(『海東繹史』「百濟」城邑條)<br>라 하였다. 千寬宇는 이 점에 着案하여 井邑 古阜는 中方이 아닌 南方이고, 金堤金溝도 南方이 아닌 中方으로, 里數(註 8의&#65308;表&#65310;참조)도 扶餘~古阜는 260里가 아닌 360里로, 扶餘~金溝는 360里가 아닌 260里로 해야 사실과 가깝다고 하고, 『周書』&#183;『北史』 및 『括地志』에 보이는 中&#183;南方의 方位와 距離가 모두 뒤바뀌어 있으니, 마땅히 ‘中方 古沙城(古阜) 國南二百六十里’는 ‘南方 古沙城 國南三百六十里’로, ‘南方 久知下城(金溝) 國南三百六十里’는 ‘中方 久知下城 國南二百六十里’로 修正해야 정확한 記述이 된다고 하였다.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p.212)<br>今西龍은 『日本書紀』「神工紀」49年條의 肖古王父子가 千熊長&#24421;을 맞아서 古沙山에 올라가 磐石 위에서 맹세했다고 하는 古沙山도 古阜이며, 『三國史記』에는 古&#30471;夫里라 쓰여 있는데 古阜의 東南에 있는 斗升山(都順山) 古城이 古沙城址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東國輿地勝覽』에는 ‘斗升山在郡東五里 一云都順山 有古石城 周一萬八百十二尺 跨于大壑 疑瀛州時舊城也’라 되어 있는데, 瀛州는 高麗 太祖王代의 古阜의 지명이라고 하였다. (「百濟五方五部考」p.290)<br> ≪參考文獻≫<br>『三國史記』卷36「地理志」古阜郡條.<br>『東國輿地勝覽』<br> 丁若鏞, 『與猶堂全書』6「疆域考」八道沿革總&#21465;.<br>韓鎭書, 『海東繹史』續8「百濟」城邑條.<br>千寬宇, 「馬韓諸國의 位置와 試論」『東洋學』9, 1979.<br>今西龍, 「百濟五方五部考」『百濟史硏究』1934.<br></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東方曰得安城,<span class="lyrPopup" id="jo_012_f049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49 得安城</strong><span class="lyrpop_cont"> 得安城은 현재 忠淸南道 恩津으로 비정되고 있다.<br>&#65308;참조&#65310;<br> 『周書』百濟傳 註 10)<br>得安城<br> 『三國史記』「地理志」百濟都督府 13縣條에는 ‘得安縣 本德近支’로, 『東史綱目』熊津都督府考에는 ‘三國史記地理志 都督府一十三縣 …… 得安縣 本德近支 濟志作德近郡 今恩津’으로, 『與猶堂全書』忠淸道條에는 ‘百濟 …… 所都曰居拔城 …… 東曰得安城 李勣奏文云 得安縣 本德近支 &#21363;今之恩津’으로, 『海東繹史』城邑條에도 ‘得安城據李勣奏狀 得安縣 本德近支也 德近支者 今恩津縣也’으로 되어 있는데, 得安城=恩津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r>今書龍은 東方 得安城은 지금의 忠淸南道 南端에 있는 恩津이니, 仇尸波知를 安遠이라 고쳤던 例와 같이 近支를 安으로 쓴데서 安의 訓은 近支이며, 百濟末에 鬼室福信이 復興軍을 일으켰을 때 이 地方이 新羅에 빼앗겼기 때문에 金堤方面에 있는 避城을 버리고 北으로 移動한 것을 보면 得安城은 바로 恩津의 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百濟五方五部考」p.290) 그러나 舊恩津의 地가 지금의 恩津邑 東南 12里에 있고, 그 東에 摩耶山古城址가 있어 『勝覽』에 ‘摩耶山 在縣南二十四里 鎭山’&#183;‘摩耶山古城 石築周五千七百十尺 內有三井 今廢’ 및 ‘大井 在摩耶山古城下二里 俗云古國御井也 其地西有衰虎山 東有衰龍串’라 기록되어 있으니, 摩耶山 古城址는 得安城址가 되고 지금의 恩津邑 西 1里에 있는 皇華山城이 곧 得安城이라고 하였다. (앞의 논문, p.291)<br> ≪參考文獻≫<br>『三國史記』卷37「地理志」4 百濟都督府 13縣條.<br>安鼎福, 『東史綱目』附下 熊津都督府條.<br>丁若鏞, 『與猶堂全書』6「疆域考」忠淸都條.<br>韓鎭書, 『海東繹史』續8「百濟」城邑條.<br>今西龍, 「百濟五方五部考」『百濟史硏究』1934.<br></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南方曰久知下城,<span class="lyrPopup" id="jo_012_f050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50 久知不城</strong><span class="lyrpop_cont"> 久知不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의 金堤 金溝說, 全南 長城說, 全南 求禮說, 現在地<br> 不明說 등으로 각각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br>&#65308;참조&#65310;<br> 『周書』百濟傳 註 11)<br>久知下城<br> 久和下城을 『括地志』에서는 卞城이라 하였다. 久和下城의 位置에 대해서는 지금의 金堤 金溝說, (丁若鏞, 『與猶堂全書』; 千寬宇,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pp.211~212) 全南 長城說, (今西龍, 『百濟史硏究』p.292; 李丙燾, 『韓國史』p.540) 全南求禮說, (李基東, 『韓國史講座』p.236) 現在地 不明說, (坂元義種, 「譯註中國史書百濟傳(周書)」pp.268~269) 等으로 각각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br>千寬宇는 南方 久知下城-卞城에 대해 丁若鏞이 仇知只山-金堤 金溝에 이를 비정하였는데, 이것은 扶餘-恩津이 百里라는 『括地志』의 里數에서 扶餘-金溝가 대략 360里(註: 260里가 실제에 가까움)에 해당하는 점과, 仇知只山(gi&#1241;u-tie-tsie-san)-久知下(ki&#1241;u-tie-ra)가 정확히 一致되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音相似라면 古地名比定에서는 용납될 수 있으리라는 점 및 百濟 5方을 踏襲한 唐 5都督府의 하나인 ‘金連’이 ‘金溝’의 美化된 名稱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丁若鏞의 견해가 옳다고 하였다. 또한 『括地志』 그대로 古阜를 ‘中方’으로 보고, 그 보다 더 南쪽에서 ‘南方’을 찾는 것이 原則上 옳은 方法으로, 今西龍이 ‘國南三百六十里’가 되는 長城을 ‘南方’에 比疑한 것이 그것인데, 長城-‘古尸伊’가 ‘久知下’-‘卞’과 音韻上 比較가 되지 않을 뿐더러 ‘南方’을 長城이라 할 때 5方 가운데 유독 ‘南方’만이 地理的으로 偏在하게 된다고 하였다. (앞의 논문, pp.211~212)<br>한편 今西龍은 南方 久知下城은 『括地志』에는 卞城이라 되어 있는데, 『括地志』를 引用한 『翰苑』에서는 久知의 2字를 빼버리고 下를 卞으로 썼다고 추측하였다.<br>또한 그 位置를 ‘國南三百六十里’라 기록한 것은 貴重한 記事인데, 中方이 意外로 古阜에 위치하여 北方&#183;東方이 國都에 가깝기 때문에 『括地志』의 逸文을 미뤄 보면 그곳은 全羅北道 金溝(古名 仇知只山)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고, 이 逸文에 의해 卞城은 久知下의 잘못임이 틀림없는데 ‘國南三百六十里’라는 기록으로 南原&#183;淳昌&#183;潭陽&#183;長城에서 더 南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長城의 古名을 久知伊라 하고 伊는 伴字를 代用한 古地名&#183;古人名에 많은데, 伴의 音은 卞에 가깝다고 하였다. (앞의 책, pp.290~292) 坂元義種은 卞은 ‘久知下’에서 ‘下’의 誤인 듯 하고 그 現在地는 不明이라 하였다. (앞의 논문, pp.268~269)<br> ≪參考文獻≫<br>丁若鏞, 『與猶堂全書』6「疆域考」八道沿革總&#21465;.<br>李丙燾, 『韓國史』(古代篇), 1959, 乙酉文化社.<br>千寬宇, 「馬韓諸國의 位置試論」『東洋學』9, 1979.<br>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1985, 一潮閣.<br>今西龍, 『百濟史硏究』1934.<br>坂元義種, 「譯註中國史書百濟傳(周書)」『百濟史の硏究』1978.<br></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西方曰刀先城,<span class="lyrPopup" id="jo_012_f051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51 刀先城</strong><span class="lyrpop_cont"> 刀先城은 『括地志』에는 '力光城’이라 되어 있는데, 이곳의 位置比定은 未定이다.<br>&#65308;참조&#65310;<br> 『周書』百濟傳 註 12)<br>刀先城<br> 刀先城은 『括地志』에 力光城이라 되어 있는데, 이곳의 位置比定은 未定이다. 丁若鏞은 ‘刀先城 疑在今沃溝海上’(『與猶堂全書』八道沿革總&#21465;)이라고 하였으며, 今西龍은 『括地志』에는 力先城(原文을 보면 실제로 光인지 先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 특히 刀先城이라는 記事를 먼저 대하고서 그 先入見으로 보면 先으로 읽기 마련인 듯 하다. 『翰苑』에 대하여 校訂&#183;解說을 붙인 竹內理夫는 光으로 읽었으며, 諸家의 견해도 마찬가지다.-竹內理夫 校訂&#183;解說本,『翰苑』p.45 참조- 今西龍이 誤讀한 것인지 印刷上의 결함인지 알 수 없다: 註釋者 註)이 ‘國西三百五十里’에 있다 하였으니, 忠淸南道의 西北端에서 求할 수 밖에 없는데 里數에 誤記나 誇張이 있어 地點이 명확치 않다고 하였다. (『百濟史硏究』p.292)<br>最近 千寬宇는 刀先城을 瑞山&#183;唐津 방면과 禮山&#183;大興에 잠정적으로 비정하였다. 그는 刀先 혹은 그 誤寫라고 할 力光은 ‘國西三百五十里’라 하였으니, 이것을 扶餘의 正西方으로 본다면 丁若鏞의 견해와 같이 沃溝 海上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朝鮮後期에 水軍僉使鎭이 있던 古群山島와 같은 良港을 ‘西方’으로 볼 수도 있지만, 『資治通鑑』龍朔 元年條 胡三省 註의 ‘任存城 在百濟西部 任存山’이라고 한 데에서 ‘西部’-‘西方’은 扶餘의 正西方 이 아니라 그 西北方인 任存城-禮山&#183;大興 방면에 있었으니, 扶餘의 西北方으로 『括地志』 里數의 350里되는 地點을 찾아보면 대략 瑞山&#183;唐津 방면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刀先 혹은 力光과 音相似한 곳이 없다고 하였다. 한편 扶餘 西北方의 要地로는 任存城~禮山&#183;大興이 첫째로 손꼽히는데 扶餘~大興은 『括地志』의 里數로 계산하면 대략 200里 정도로서 ‘國西三百五十里’와 큰 差異는 있지만, ‘任存’의 古音은 nzi&#1241;m-dzu&#1241;n으로 ‘刀先’이 만일 ‘刃先’의 誤記라면 그 古音이 nzi&#1241;n-sien으로 약간의 近似가 보인다고 하였다.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pp.212~213)<br> ≪參考文獻≫<br>丁若鏞, 『與猶堂全書』6「疆域考」八道沿革總&#21465;.<br>千寬宇,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東洋學』9, 1979.<br>今西龍, 『百濟史硏究』1934.<br></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北方曰熊津城.</p><span class="lyrPopup" id="jo_012_f052_comment" style="display: none;"><p><strong>052 熊津城</strong></p><span class="lyrpop_cont"><p> 熊津은 '곰나루’의 漢子譯이며, 지금의 公州이다.<br>&#65308;참조&#65310;<br>1.『周書』百濟傳 註 7)<br>固麻城<br> 熊津은 ‘곰나루’의 漢字譯이며 지금의 公州이다.<br>『日本書紀』「雄略天皇紀」21年 春3月條에는 文周王이 國都를 熊川(公州)으로 옮긴 데 대하여 ‘天皇聞百濟爲高麗所破 以久麻那利賜汶州王救興其國’이라 하였는데, ‘久麻那利’는 熊川의 古名 古麻城 또는 ‘固麻那禮(利)’이다.<br>‘北方은 熊津城이다’라는 구절과 관련하여 李弘稙은 이 記事는 百濟의 南遷 즉, 熊津都邑時代의 일임이 명료한 사실인데, 『周書』以來의 中國正史에서는 百濟가 扶餘로 南遷한 末期까지의 상태와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梁職貢圖論考」pp.404~405) 즉, 『周書』에서 ‘治固麻城 其外更有五方 …… 北方曰熊津城’이라고 한 것은 부여(所夫里 泗&#27800;: 原註)로 國都를 옮긴 이후 地方을 5方으로 나눈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國都를 여전히 ‘固麻城’이라 하고 5方時代에 北方의 중심을 熊津城으로 삼은 것은 熊津城을 固麻와 別城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隋書』에서는 泗&#27800;城을 ‘其都曰居拔城’이라고 明記하고 있는데, 『北史』에서 ‘其都曰居拔城 亦曰固麻城’이라 하고, 5方 중 ‘北方曰熊津城’이라 한 것은 『周書』以來의 기사를 답습하여 固麻城이 곧 熊津城이라는 것을 인식치 못한 소산이라고 하였다. (앞의 논문, pp.404~405)<br>한편 坂元義種은 『隋書』百濟傳에는 ‘居拔城’이라 되어 있고, 當時의 國都는 泗&#27800;(忠淸南道 扶餘의 地)이므로 固麻城은 大城(王城)을 의미한다고 하였다.(「譯註中國史書百濟傳(周書)」p.268) 여기서 坂元義種의 見解를 따른다면 扶餘로 수도를 옮긴 뒤에도 여전히 泗&#27800;라는 이름 外에 ‘固麻城’이라 불리웠을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마치 현재의 수도인 ‘서울’이 行政區域上의 地名이라는 의미 外에 首都라는 意味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br>≪參考文獻≫<br>『日本書紀』卷 14「雄略天皇紀」21年條.<br>李弘稙, 「梁職貢圖論考」『韓國古代史의 硏究』1971.<br>坂元義種, 「譯註中國史書百濟傳(周書)」『百濟史の硏究』1978.<br> 2.『周書』百濟傳 註 8)<br>五方<br>5方과 관련하여 百濟의 地方制度에 대해서 살펴보면, 百濟의 地方行政制度는 王權强化의 核心的인 作業으로서 대체로 聖王의 泗&#27800;遷都와 더불어 정비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확실해진 것은 今西龍의 「百濟五方五部考」 以來 여러 學者들의 硏究에 의해서였다. 今西龍에 의하면 武寧王代에는 ‘五方’의 稱이 없이 ‘22&#27280;魯’制였으나 聖王 27年 경에는 城主制의 ‘五方’으로 되었고, ‘五方’이 완전한 行政區劃으로서의 ‘五部’로 된 것은 義慈王代라고 하였으나, (앞의 논문, pp.283~326) 以後에 그가 쓴 「百濟史講話」에서는 聖明王(聖王)의 初期에 國內의 五方五部制度도 完備되어졌다고 하였다.<br>이러한 地方行政制度의 始源에 대해 金哲埈은 「百濟社會와 그 文化」에서 『三國史記』「百濟本紀」에 의하면 溫祚 31년에 南&#183;北部, 33年에 東&#183;西部를 두어 首都地域까지 합쳐 5部制가 성립되었으며, 이러한 百濟初期의 全國行政區域으로서의 4部制는 泗&#27800;時代의 ‘五方’으로 정비되고, 首都行政區域도 熊津時代부터 支配層勢力을 首都로 집중시켜 支配體制를 强化한 뒤에 ‘五部’로 나누게 되었다고 하였다.<br>한편 千寬宇는 百濟의 地方行政組織이 體系化되는 記錄이 分明치는 않지만, 本格的인 地方行政區劃이 시작되는 것은 近肖古王 8年의 시기라 하였다. 그 방증사료로서 『日本書紀』「仁德天皇紀」41年(353)의 ‘遣紀角宿&#31152;於百濟 始分國郡疆場 具錄鄕土所出’이란 기록을 들고 있다. (「三韓의 國家形成」(上) pp.7~8; 「三韓의 國家形成」(下) pp.121~122) 또 扶餘가 固麻城(公州)으로 混同된 過程을 史料를 摘出하여 綜觀하여, 『梁書』百濟傳에는 ‘號所治城曰固麻 謂邑曰&#27280;魯 如中國之言郡縣也 其國有二十二&#27280;魯 皆以子弟宗族分據也’라 하여 公州- ‘二十二&#27280;魯’時代이고, 『周書』百濟傳에는 ‘治固麻城 其外更有五方 …… 北方曰熊津城’이라 하여 扶餘-‘五方’時代인데도 公州와 扶餘가 混同되고 있고, 『隋書』百濟傳의 ‘其都曰居拔城’이라는 扶餘時代의 기록을 거쳐 『北史』百濟傳에는 ‘其都曰居拔城 亦曰固麻城 其外更有五方 …… ’이라 하여 公州와 扶餘의 混同이 ‘亦曰’로 처리되고 있다고 하고, 『舊唐書』百濟傳의 ‘其王所居有東西兩城 …… 又外置六帶方(六方&#65311;)管十郡’과 『新唐書』百濟傳의 ‘王居東&#183;西二城 …… 方統十郡’에서는 東西兩分說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래의 史書에 보인 兩都의 混同을 文脈上으로 合理化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p.13의 註 15)<br>또한 『周書』&#183;『北史』&#183;『翰苑』所引『括地志』의 王城 및 五方 관계기록을 圖表化하였다.<br></p><table width="100%"><tbody><tr><td>&#65308;百濟 扶餘時代의 王城&#183;五方表&#65310;</td></tr></tbody></table><div class="dl_data_all"><table width="" height=""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nbsp;</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周書』百濟傳</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北史』百濟傳</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翰苑』所引『括地志』</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王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固 麻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俱拔城 亦曰 固麻城 </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王城&#183;居狄城 方一里半 可方(万&#65311;)餘家 - 部有五百人</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中方</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古 沙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古 沙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古沙城 國南二百六十里 方百五十里步 方統 兵千二百人</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東方</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得 安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得 安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得安城 國東南百里 方一里</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南方</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久知下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久 知 下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卞城 國南三百六十里 方一百三十步</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西方</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刀 先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刀 先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力光城 國西三百五十里 方二百步</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北方</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熊 津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熊 津 城</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熊津城 一名固麻城 國東北六十里 方一里半</td></tr><tr height="" align="" valign="middle" width="" rowspan="" colspan=""><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1"> 參考</td><td width="" height="" align="" class="X_ARTICLE" valign="middle" bgcolor="" rowspan="1" colspan="3"> 其國(百濟國)……東西四百五十里 南北九百餘里(『周書』&#183;『北史』百濟傳)</td></tr></tbody></table></div><p>그리고 扶餘의 古號가 『三國史記』에는 ‘所夫里’-‘泗&#27800;’인데 대하여 中國記錄에는 ‘居拔’(『隋書』) &#183; 俱拔(『北史』) &#183; ‘居狄’(『括地志』)으로 되어 있는 것은 百濟語의 二重構造(馬韓系&#183;夫餘系 中 어느 하나일 듯)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p.12)<br> ≪參考文獻≫<br>『梁書』卷54「東夷列傳」百濟條.<br>『周書』卷49「異域列傳」百濟條.<br>『隋書』卷81「東夷列傳」百濟條.<br>『北史』卷94「列傳」百濟條.<br>『舊唐書』卷199上「東夷列傳」百濟國條.<br>『新唐書』卷220「東夷列傳」百濟條.<br>『日本書紀』卷11「仁德天皇紀」41年條.<br>金哲埈, 「百濟社會와 그 文化」『韓國古代社會硏究』1975.<br>李丙燾, 「風納里土城과 百濟時代의 蛇城」『韓國古代史硏究』1976.<br>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三韓攷-」(上&#183;下)『韓國學報』2&#183;3合輯, 1976;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東洋學』9, 1979.<br>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三國時代를 中心으로-」『韓國史論』7, 1981.<br>盧重國, 「漢城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27280;魯體制를 中心으로-」『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1985, 三英社.<br>今西龍, 「百濟五方五部考」『百濟史硏究』1934, 近澤書店.<br>末松保和, 『任那興亡史』1949.<br>山尾幸久, 「朝鮮三國の軍區組織」『古代朝鮮と日本』1974, 龍溪書舍.<br>武田幸男,「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1980.<br></p></span><p><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p></span><p> 王姓<span style="color: rgb(11, 11, 146);">餘</span><span class="lyrPopup" id="jo_012_r083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083 </strong><span class="lyrpop_cont">『周書』「百濟傳」과『御覽』卷781「四夷部」所引에는 ‘夫餘’로 되어 있다.</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氏,<span class="lyrPopup" id="jo_012_f053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53 王姓餘氏</strong><span class="lyrpop_cont"> 『周書』百濟傳 및『太平御覽』「四夷部」百濟條 所引『北史』에는 ‘餘氏’가 ‘夫餘氏’로 되어 있다. 또한『三國遺事』「前百濟」에 의하면 ‘其世系與高句麗同出夫餘故以解爲氏’라 하여 解氏 또한 王姓이었음을 전해 준다.<br>&#65308;참조&#65310;<br> 『魏書』百濟傳 註 3)<br>其先(先祖)<br>夫餘族 系統의 高句麗 流移民集團이 百濟의 建國 主體勢力이었음은 周知하는 바이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br>①『三國史記』「百濟本紀」始祖溫祚王條: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 故以扶餘爲氏<br>②『魏書』의 百濟傳: 百濟國 其先出自夫餘 …… (中略) …… 臣與高句麗源出扶餘<br>③『三國史記』「百濟本紀」聖王 16年條: 春 移都於泗&#27800; 一名所夫里 國號南扶餘<br>④『三國遺事』南扶餘&#183;前百濟條: 又按量田帳籍曰 所夫里郡田丁柱貼 今言扶餘郡者 復上古之名也 百濟王姓扶氏 故稱之<br>한편,『三國遺事』의 前百濟條에서는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 故以解爲氏’라 하여 解氏 또한 王姓이었음을 傳해 준다. 그리고 後代의 安鼎福은『東史綱目』에서 ‘卒本人解溫祚 立國於慰禮城’이라 하였고『東國通鑑』에는, ‘百濟源出扶餘 故以扶餘爲氏’라 記錄되어 있다.<br>王姓問題는 근자에 王位繼承問題와 관련하여 많은 論著들이 나왔는데 이들 學說史的으로 整理한 論文이 있다.(盧重國,「解氏와 扶餘氏의 王室交替와 初期 百濟의 成長」)<br>한편, 百濟建國 主體勢力=扶餘族系統의 高句麗 流移民集團이라는 文獻硏究 結果는 考古學界의 硏究結果에서도 같은 結論으로 밝혀져 이를 補强해 주고 있다.<br>≪參考文獻≫<br>『三國史記』卷23「百濟本紀」1 始祖 溫祚王條; 卷26「百濟本紀」4 聖王條.<br>『三國遺事』卷2 南扶餘&#183;前百濟條.<br>安鼎福,『東史綱目』<br> 徐居正,『東國通鑑』<br> 李基白,「百濟王位繼承考」『歷史學報』11, 1959.<br>尹世英,「可樂洞 百濟古墳 第一&#183;第二號墳發掘調査報告」『考古學』3, 1974.<br>千寬宇,「三韓의 國家形成」(下)『韓國學報』3, 1976.<br>姜仁求,「百濟古墳硏究」1977, 一志社.<br>盧重國,「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韓國史論』4, 1978;「解氏와 扶餘氏의 王室交替와 初期百濟의 成長」『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1981, 知識産業社;「百濟建國考」『百濟硏究』13, 1982.<br>李基東,「百濟의 王室交代論에 대하여」『百濟硏究』12, 1981.<br>金聖昊,『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1982, 知文社.<br>李道學,「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의 檢討」『韓國史硏究』45, 1984.<br>笠井倭人, 「中國史書による百濟王統譜」『日本書記硏究』8號, 1975.<br>坂元義種,「中國史書からみた百濟王とその系譜」&#183;「中國史書における百濟王關係記事の檢討」『百濟史の硏究』1978, &#22617;書房, 東京.<br></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號「於羅<span style="color: rgb(11, 11, 146);">瑕</span>」, 百姓呼爲 「<span style="color: rgb(11, 11, 146);">&#38828;吉支</span><span class="lyrPopup" id="jo_012_r085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085 </strong><span class="lyrpop_cont">『御覽』卷781「四夷部」所引에는 ‘&#38828;士口之’로 되어 있다.</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span class="lyrPopup" id="jo_012_f054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54 王妻號於陸</strong><span class="lyrpop_cont"> 『周書』百濟傳에는 ‘妻號於陸’이라 하여 ‘王’字가 없다.<br>&#65308;참조&#65310;<br> 『周書』百濟傳 註 13)<br>於羅瑕<br> 百濟 言語에 대한 기록인 『梁書』 百濟傳의 ‘今言語&#183;服章 略與高驪同’과 더불어 이 句節은 百濟語가 二重構造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방증사료로 이용되어 왔다. 즉, 百濟語는 夫餘-高句麗系의 支配族言語(於羅瑕&#183;於陸)와 土着馬韓系統인 被支配族言語(&#38828;吉支)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p.351의 註 1; 李基文, 「韓國古代諸語系統論」pp.186~189;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pp.132~133; 千寬宇,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p.204)<br>李基文은 百濟語의 二重構造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추정할 수는 없으나 支配族의 言語가 被支配族의 言語를 전면적으로 同化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被支配族의 언어에 同化되어 갔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리고 『梁書』의 기록과는 달리 현재 남아 있는 百濟의 언어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百濟語가 高句麗語와는 많이 다르고 新羅語와 매우 비슷하다고 밝혔다. (앞의 논문, p.187) 또한 百濟語硏究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 古代 日本語인데, 百濟의 文物과 함께 日本에 흘러 들어간 百濟語 단어들이 고스란히 古代 日本의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하면서 本文의 기사를 지적하였다. 즉, 百濟語의 音相과 의미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 그 기록 자체만으로도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데, 『日本書紀』에서 百濟의 王을 orikoke, worikokisi, konikisi, kokisi 등으로, 夫人(妃)을 woriku, woruku, orike 등으로 새기고 있음은 이 기록의 신빙성을 완전무결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百濟語硏究와 관련된 몇 問題」p.260)<br>千寬宇는 『日本書紀』의 ‘키시’(王&#183;君&#183;吉士)-‘코니키시’(國王&#183;王&#183;主)에서 ‘코니키시’는 &#38828;吉支와 비교되고, ‘오루쿠’(王后)-‘코니오루쿠’(太后&#183;王后)에서 ‘오루쿠’는 於陸과 대비되는데, 王의 뜻이라는 於羅瑕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앞의 논문, p.132)<br>李丙燾는 王稱에 대한 固有語로서 『周書』에서만 治者階級인 夫餘系統에서는 ‘於羅瑕’라 하고 被治階級인 馬韓系統에서는 ‘&#38828;吉支’라 하며, 王室에서는 妻(王妃)를 ‘於陸’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於羅瑕’는 종래 巫歌의 ‘어라아 만수(萬壽&#183;萬歲)’ 云云의 ‘어라아’로, ‘於陸’은 後世語에 男同生의 妻稱인 ‘올케’로 변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日本書紀』에서 百濟王을 ‘コニキシ(코니키시)’ 또한 ‘コキシ(코키시)’라고 訓讀한 것은 『周書』의 &#38828;吉支와 同音임을 알 수가 있는데, ‘&#38828;’&#183;‘コニ’&#183;‘コ’ (コ는 コニ의 略音)는 國語에 ‘큰(大)’의 寫音이고, ‘吉支’&#183;‘キシ’는 吉師(百濟語)와 같이 貴人의 尊稱이라고 하였다. (앞의 책, p.351)<br> ≪參考文獻≫<br>李崇寧, 「百濟語 硏究와 資料面의 問題點」『百濟硏究』2, 1971.<br>都守熙, 「百濟王稱語小考-於羅瑕&#183;&#38828;吉支&#183;구드래&#183;구다라를 중심으로-」『百濟硏究』3, 1972; 「百濟地名硏究」『百濟硏究』10&#183;11, 1979&#183;1980; 「百濟前期의 言語에 관한 硏究」『百濟硏究』13, 1982.<br>김선기, 「백제 지명 속에 있는 고대음운 변천」『百濟硏究』4, 1973.<br>趙載勳, 「百濟語硏究序說」『百濟文化』6, 1973.<br>兪昌均, 「百濟地名&#183;表記用字에 對한 檢討」『嶺南大論文集(人文篇)』9, 1975.<br>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韓國學報』3, 1976; 「馬韓諸國의 位置 試論」『東洋學』9, 1979.<br>李丙燾, 『譯註 三國史記』1977.<br>姜吉云, 「百濟語의 系統論」『百濟硏究』8&#183;9, 1977&#183;1978.<br>李基文, 「韓國古代諸語系統論」『韓國史』23, 1978;「百濟語硏究와 관련된 몇 問題」『百濟硏究』13, 1982.<br></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夏言&#20006;王也. <span style="color: rgb(11, 11, 146);">王</span><span class="lyrPopup" id="jo_012_r086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086 </strong><span class="lyrpop_cont">『周書』「百濟傳」에는 없다.</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妻號「於陸」, 夏言妃也. </p><p><br></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388C4858C4B91523" class="txc-image" width="61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10" exif="{}" data-filename="thtuut.jpg" id="A_24388C4858C4B91523EE4A"/></p><p>백제국은 동서450리이고 남북으로 900여리이다.(북사 백제전)</p><p><br></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6CC24958C4BA4218" class="txc-image" width="576"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76" exif="{}" data-filename="20170311_092833.jpg" id="A_246CC24958C4BA42189749"/><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발굴된 목간에서</p><p>&nbsp;"...三月中監數長人 ...出背者得捉<span style="color: rgb(255, 0, 0);">得安城</span>..."&nbsp;..</p></span><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3월 감독하는 몇명의 우두머리가 ...달아난 죄인들을 득안성에서 잡았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lt;덕안성&gt;</span></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p><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br></span></p><p><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a><span style="color: rgb(0, 0, 0);">卷第二十八 百濟本紀 第六&nbsp;</span></a><a><span style="color: rgb(0, 0, 0);">義慈王&nbsp;</span></a><a><span style="color: rgb(0, 0, 0);">二十年 </span></a></span><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br></span></p><p><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定方</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以王及太子</span><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孝</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183;王子</span><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泰</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183;</span><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隆</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183;</span><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演</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及大臣將士八十八人&#183;百姓一萬二千八百七人, 送京師. 國&#22834;有五部&#183;三十七郡&#183;二百城&#183;七十六萬戶, 至是析</span><span class="lyrPopup" id="sg_028_r021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021 </span></strong><span class="lyrpop_cont" style="color: rgb(255,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구당서(舊唐書)》 권199상 백제전(百濟傳) 및 《삼국사절요》에는 分으로 되어 있다.</span><span class="lyrpop_close" style="color: rgb(255,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닫기</span></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置</span><span title="지명" style="color: rgb(255,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熊津</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span style="color: rgb(255, 0, 0);">&#183;馬韓&#183;東明&#183;金漣&#183;德安五都督府</span>, 各統州縣, 櫂</span><span class="lyrPopup" id="sg_028_r022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022 </span></strong><span class="lyrpop_con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삼국사절요》 및 주자본에는 擢으로 되어 있다.</span><a><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history.go.kr%2Fimages%2Fbutton%2Fbtn_origin_image_annotation.jpg"></a></span><span class="lyrpop_close"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닫기</span></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渠長爲都督&#183;刺史&#183;縣令以理</span><span class="lyrPopup" id="sg_028_r023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023 </span></strong><span class="lyrpop_con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신당서(新唐書)》 권220 백제전(百濟傳)에는 治로 되어 있다. 고려 성종의 이름 治의 피휘(避諱)이다.</span><a><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b.history.go.kr%2Fimages%2Fbutton%2Fbtn_origin_image_annotation.jpg"></a></span><span class="lyrpop_close"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닫기</span></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之.</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51, 102, 102);">소정방</span>이 왕과 태자 <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51, 102, 102);">효</span>(孝), 왕자 <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51, 102, 102);">태</span>(泰), <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51, 102, 102);">융</span>(隆), <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51, 102, 102);">연</span>(演)<span class="lyrPopup" id="sg_028r_f107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107 </strong><span class="lyrpop_cont">의자왕의 아들. 백제 멸망 후 의자왕과 함께 포로가 되어 당으로 끌려갔다. 구체적인 행적은 알 수 없다.</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및 대신(大臣)과 장사(壯士) 88명과 주민 1만 2천 8백 7명을 <span title="국명" style="color: rgb(51, 102, 102);">당</span>나라 서울<span class="lyrPopup" id="sg_028r_f108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108 </strong><span class="lyrpop_cont">당나라의 수도 長安을 말한다. 현재의 중국 西安이다.</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로 호송하였다.<span class="lyrPopup" id="sg_028r_f109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109 </strong><span class="lyrpop_cont"><a href="http://uci.or.kr/G002+AKS-KHF_13C758C790C655U9999X0" target="_blank"><font color="#cd853f"><u>의자왕</u></font></a>이 항복한 것은 <a href="http://uci.or.kr/G002+AKS-KHF_12ACC4BC31FFFFD0660X0" target="_blank"><font color="#cd853f"><u>계백</u></font></a>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한 후 열흘 째 되는 날이었다. 백제는 소정방이 당군을 이끌고 덕물도에 도착한 지 채 한 달이 못 되어 700년 사직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백제는 원래 5부(部)<span class="lyrPopup" id="sg_028r_f110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110 </strong><span class="lyrpop_cont">전국을 다섯으로 나눈 최고의 지방 통치조직으로 東部&#183;西部&#183;南部&#183;北部&#183;中部를 말한다. 五方과 같은 것이다. 백제 말기에 와서 方과 部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部는 광역의 행정구역 겸 軍管區로서 6~10개의 郡을 포괄하였고, 또 小城으로 표현되는 縣들을 統屬하고 있었다. 部(方)의 장은 方領이라고 하였으며 달솔의 관등소지자가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五部의 中心治所는 方城이라고 하였는데 《周書》 권49 열전 백제전, 《北史》 권94 열전 백제전 및 《翰苑》 백제조에 인용된 《括地志》에 의해 方과 方城의 명칭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中方-古沙城, 東方-得安城, 南方-久知下城(卞城), 西方-刀先城(力先城), 北方-熊津城(固麻城). 이 방성은 대개가 험한 산에 의지하여 돌로 쌓았으며, 1200~700명 정도의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다.(今西龍, 「百濟五方五部考」, 《百濟史硏究》 所收, 1934 &#65372; 이기백&#183;이기동, 《한국사강좌》 1 고대편, 일조각, 1982, 235~236쪽 &#65372;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1988 &#65372; 박현숙, 「백제 지방통치체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65372; 김영심, 「백제 지방통치체제 연구-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참조).</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37군(郡)<span class="lyrPopup" id="sg_028r_f111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111 </strong><span class="lyrpop_cont">백제의 지방 통치조직의 하나. 方(部)과 城(縣) 사이에 위치하였다. 이 郡은 내부에 몇개의 城(縣)들을 통속하고 있었다. 백제에서 郡制는 泗&#27866;遷都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2년조에 “是歲 百濟聖明王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凡六郡之地 遂復故地”에 나오는 ‘6郡’은 성왕대의 郡制의 실시를 방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郡의 長은 郡將(《周書》 권49 열전 백제전) 또는 郡令(《日本書紀》 권19 欽明紀 4년조)이라 하였다. 郡에는 郡將이 3명 파견된 것이 특징이다. 郡將은 德率의 관등 소지자가 맡는 것이 원칙이나 黑齒常之가 달솔로서 風達郡將이 된 것에서 보듯이 달솔의 관등소지자도 맡기도 하였다.</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2백 성(城)<span class="lyrPopup" id="sg_028r_f112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112 </strong><span class="lyrpop_cont">백제의 지방 통치조직 중 최하의 조직. 《翰苑》 백제조에 “郡縣置道使”라는 기사는 郡 아래에 縣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縣은 바로 城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城(縣)의 장은 城主(《日本書紀》 권19 欽明紀 4년조) 또는 道使(《翰苑》 백제조)로 불리웠다. 그런데 지방관이 파견된 성의 수에 대해 본 기사는 200성이라 하고 있지만 정림사지오층석탑에 새겨진 《大唐平百濟國碑銘》에는 250현으로, 《삼국사기》 36 잡지 지리3에는 104현으로 나오고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 이 중 본 기사의 200성과 정림사지오층석탑에 새겨진 《大唐平百濟國碑銘》의 250현은 백제 당시의 현의 수의 변동을 짐작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地理志의 104현은 신라가 새로운 기준에서 지방 통치조직을 편제하면서 축소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76만 호(戶)<span class="lyrPopup" id="sg_028r_f113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113 </strong><span class="lyrpop_cont">백제 멸망 당시의 호수. 백제의 戶數에 대해서는 《구당서》 권199 상 열전 백제전과 《신당서》 권220 열전 백제전 및 《通典》 권181 邊防一 百濟條에는 《戶76萬》으로 나온다. 그러나 定林寺址五層石塔에 새겨진 《大唐平百濟國碑銘》에는 “戶二十四萬 口六百二十萬”으로 나오고 있고, 《삼국유사》 권1 紀異篇 변한&#183;백제조에는 “百濟全盛之時 十五萬二千三百戶”라 나오고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지역을 나누어 <span title="지명" style="color: rgb(51, 102, 102);">웅진</span>(熊津)&#183;마한(馬韓)&#183;동명(東明)&#183;금련(金련漣)&#183;덕안(德安) 등 5개의 도독부<span class="lyrPopup" id="sg_028r_f114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114 </strong><span class="lyrpop_cont">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후 백제고지를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다섯개의 도독부. 그 명칭은 熊津&#183;馬韓&#183;東明&#183;金漣&#183;德安都督府이다. 이 중 중심이 된 것은 웅진도독부였다. 이 5도독부 중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웅진도독부(현재의 충남 공주시)와 덕안도독부(현재의 충남 論山郡 恩津面)이다. 德安의 위치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권36 잡지 지리3 전주 德殷郡條에는 “德殷郡 本百濟德近郡 景德王改名 今德恩郡”이라 한 기사 참조. 그러나 백제 멸망 후 곧 각처에서 부흥군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웅진도독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독부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 점은 《삼국사기》 권37 잡지 지리6에 5도독부는 보이지 않고 대신 1都督府-7州制만 보이고 있는데서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따라서 이 5도독부제는 한갖 圖上의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구당서》 권83 열전 제33 소정방전에는 “百濟悉平 分其地爲六州”라 하여 백제를 평정한 후 그 故地를 6州로 편성하였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으나, 대다수의 사료들이 5都督府를 둔 것으로 되어 있어 6州로의 편성은 취신하기 어렵다.(5도독부의 위치와 성격에 대해서는 천관우, 「마한제국의 위치시론」, 《동양학》 9, 단국대학교, 1979 참조. 이 5도독부 가운데 핵심인 웅진도독부의 조직에 대해서는 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일본정책」, 《백산학보》 34, 1987 참조).</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를 두어 각각 주&#183;현들을 통할하게 하고<span class="lyrPopup" id="sg_028r_f115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115 </strong><span class="lyrpop_cont">동일한 내용이 《구당서》 권199 상 열전 백제전에 나온다. 그러나 정림사지오층석탑에 새겨진 《大唐平百濟國碑銘》에는 “凡置五都督府 三七州 二百五十縣”이라 하여 주와 현의 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5도독부제가 폐지된 후 웅진도독부 하에 두어진 州&#183;縣의 수에 대해 《삼국사기》 권37 잡지 지리4 도독부조에는 1도독부-7주-51현으로 나온다.</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 우두머리를 뽑아서 도독(都督)&#183;자사(刺史)<span class="lyrPopup" id="sg_028r_f116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116 </strong><span class="lyrpop_cont">州의 장관을 말한다. 刺史는 漢의 武帝가 部刺史를 두고 詔條를 받들어 郡國을 監察하는 일을 관장하게 함에서 비롯되었다. 魏晉시대에는 要衝地의 州에 두고 都督으로써 刺史를 兼領하게 하였다. 漢&#183;魏&#183;晉대의 刺史에 대해서는 和田 淸, 《支那官制發達史》, 汲古書院, 1932, 65~67 및 98~100쪽 참조. 唐代의 지방 통치조직은 州縣制였는데 주의 장관을 자사라 하였다. 唐은 백제를 멸망시킨 후 州縣制라고 하는 당의 지방 통치조직을 백제고지에 시행하고 주에는 자사를 두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삼국사기》 권37 잡지 지리4에 나오는 1도독부-7주-51현제이다.</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183;현령(縣令)을 삼아 관리하게 하고, 낭장(&#37070;將)<span class="lyrPopup" id="sg_028r_f117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117 </strong><span class="lyrpop_cont">定林寺址五層石塔에 새겨진 《大唐平百濟國碑銘》에는 유인원의 職啣으로 行左驍衛郞將이 나온다. 따라서 여기서의 낭장은 좌효위낭장을 말한다. 좌효위에는 左郞將 1명과 右郞將 1명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官品은 분명하지 않으나 五府의 낭장의 관품이 正5品上이어서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신당서》 권49 상 백관4 상 16衛條 및 《구당서》 권44 직관3 武官條 참조).</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span title="이름" style="color: rgb(51, 102, 102);">유인원</span>(劉仁願)<span class="lyrPopup" id="sg_028r_f118_comment" style="display: none;"><strong>118 </strong><span class="lyrpop_cont">600년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킨 당나라 장군이다.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돌아간 후 도성을 지키는 최고 책임을 맡았다.</span><span class="lyrpop_close">닫기</span></span>에게 명령하여 도성을 지키게 하였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br></span></p><p><br></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p><a><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卷第六 新羅本紀 第六&nbsp;</span></font></a><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nbsp; </span><a><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文武王&nbsp;&nbsp;</span></font></a><a><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三年春二月&nbsp;</span></font></a><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span></fon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div class="cont_view"><p class="cont_title"><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又攻</span><span title="지명"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居勿城</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183;</span><span title="지명"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沙平城</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降之, 又攻</span><span title="지명" style="color: rgb(51, 102, 102);"><span class="key_highlight"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24499;安城</span></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 斬首一千七十級</span></p><p class="cont_title"><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흠순과 천존이거물성&#183;사평성&#183;덕안성을 함락하고 1700명을 죽였다.&nbsp; ( 663년 02월(음) ) </span></p><p class="cont_title"><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br></span></p><p class="cont_title"><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주) 학계에서는 덕안을 논산시 가야곡면으로 비정한다.</span></p></div></span><p><br></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1pt;">심제.</span></p></span><p><br></p><p><br></p>
<!-- -->
카페 게시글
---高麗,百濟,新羅,伽倻
(백)발굴된 득안성 목간?
心濟
추천 0
조회 242
17.03.12 12:1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