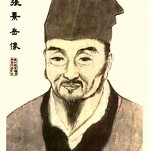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12.&#160;치혈(齒血)&#160;뉵혈(&#34884;血)&#160;설혈(舌血)의 치(治)에 대하여 논(論)하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0000ff;">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치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齒縫</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아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牙&#40806;</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중에서 나오는 것</span>을 명(名)하여&#160;<span style="color: #ff0000;">치뉵</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齒&#34884;</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는&#160;<span style="color: #f200f2;">수양명</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手陽明</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족양명</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足陽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두 경(經) 및&#160;<span style="color: #f200f2;">족소음</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足少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160;신가(腎家)의 병(病)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수양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手陽明</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하치(下齒) 중으로 들어가고&#160;<span style="color: #ff0000;">족양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足陽明</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상치(上齒) 중으로 들어가느니라. 또&#160;<span style="color: #ff0000;">신</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腎</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골(骨)을 주(主)하고 치(齒)는 골(骨)의 종(終)하는 바이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이들은 모두 치(齒)의 병(病)이 될 수 있지만, 경락(經)에서 혈(血)이 나오면 특히&#160;<span style="color: #f200f2;">양명</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 가장 많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따라서&#160;<span style="color: #f200f2;">양명</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160;<span style="color: #0000ff;">구취</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口臭</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아근</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牙根</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부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腐爛</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종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腫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 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용</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涌</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듯 나오되 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齒</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동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動搖</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지는 않다</span>. 반드시 그 사람이&#160;<span style="color: #0000ff;">평소에 비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肥甘</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신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辛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한 음식물</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物</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좋아하거나 잘 음주</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飮酒</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는 그래서 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胃</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강</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强</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한 자</span>이니, 대부분&#160;<span style="color: #f200f2;">양명</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실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實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증(證)이 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추신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抽薪飮</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청위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淸胃飮</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청위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淸胃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160;등의 제(劑)를 내복(內服)하고 외(外)로&#160;<span style="color: #00cc00;">빙옥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氷玉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부(敷)하여야 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200f2;">양명</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실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實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甚</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160;<span style="color: #0000ff;">대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大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폐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閉結</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불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서 치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齒&#34884;</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부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止</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조위승기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調胃承氣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하(下)하여야 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200f2;">신수</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腎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부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不足</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160;<span style="color: #0000ff;">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불취</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臭</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牙</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불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며 단지 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齒</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搖</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불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혹 약간 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지만 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지는 않고 아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牙縫</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時</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로 출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出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이 많으면 이는 신음(腎陰)이 불고(不固)하여&#160;<span style="color: #f200f2;">허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우연히 동</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므로 그러한 것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단지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장신</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壯腎</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하니,&#160;<span style="color: #00cc00;">육미지황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六味地黃九</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좌귀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左歸九</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혹&#160;<span style="color: #f200f2;">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하</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下</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서 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160;<span style="color: #f200f2;">허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上</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으로 부</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浮</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팔미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八味九</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소안신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小安腎九</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200f2;">음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陰虛</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유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有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병(病)으로&#160;<span style="color: #0000ff;">치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齒&#34884;</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 그 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은 조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燥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많거나 소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消&#28338;</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나타나거나 신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神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곤권</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困倦</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 소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小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단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短澁</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서 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 육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六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부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浮大</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서 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豁</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한다. 이는 비록 양명(陽明)이 유여(有餘)하여도 또한&#160;<span style="color: #f200f2;">소음</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少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은 부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不足</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 것이니,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옥녀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玉女煎</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음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陰虛</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유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有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에 속(屬)하면 오직&#160;<span style="color: #00cc00;">옥녀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煎</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이 가장 묘(妙)하지만, 반드시&#160;<span style="color: #0000ff;">대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大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실</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實</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이 많아야 쓸 수 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0000ff;">대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大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활설</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滑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혹 맥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細</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오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惡寒</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 하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下元</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火</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등의 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없으면</span>&#160;또한&#160;<span style="color: #f200f2;">격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格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으로 그러한 것이다. 당연히 앞의 토혈(&lt;吐血&gt;)의 조(條) 중의 격양(格陽)의 법(法)으로 치료(治)하여야 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00ff;">설상</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舌上</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무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無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게 실 가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縷</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과 같이 출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出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 심(心) 비(脾) 신(腎)의 맥(脈)이 모두 설(舌)에 이르므로 만약 이러한&#160;<span style="color: #f200f2;">제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諸經</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가 있으면 모두 설(舌)로 하여금 출혈(出血)케 할 수 있다.&#160;<span style="color: #00cc00;">포황</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蒲黃</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초(焦)하게 초(炒)하여 가루내고 부(付)한다. 혹은 초(炒)한&#160;<span style="color: #00cc00;">괴화</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槐花</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를 가루내어 참(&#25723;: 바르다)한다. 혹은&#160;<span style="color: #00cc00;">빙옥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氷玉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부(敷)하여도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甚</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반드시 탕(湯)이나 음(飮) 등의 방제(劑)를 써서&#160;<span style="color: #00cc00;">삼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三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의 화</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火</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를 청</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淸</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
<!-- -->
카페 게시글
잡증모07 (28-30)
12. 치혈(齒血) 뉵혈(衄血) 설혈(舌血)의 치(治)에 대하여 논(論)하다
코코람보
추천 0
조회 16
24.01.31 08:5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