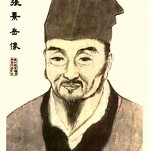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13.&#160;객혈(喀血)&#160;타혈(唾血)&#160;담연혈(痰涎血)에 대한 치(治)를 논(論)하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f0000;">객혈</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喀血</span><span style="color: #ff0000;">)&#160;</span><span style="color: #ff0000;">타혈</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唾血</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고(古)에 모두 이르기를 &quot;신(腎)에서 나온다.&quot; 하였고, 담연(痰涎)의 혈(血)은 &quot;비(脾)에서 나온다.&quot; 하였으나, 이 또한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객혈</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喀血</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160;<span style="color: #0000ff;">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喉</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중에서 약간 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도 바로 나오니</span>,&#160;<span style="color: #ff0000;">해혈</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咳血</span><span style="color: #ff0000;">)&#160;</span><span style="color: #ff0000;">수혈</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嗽血</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160;<span style="color: #0000ff;">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쓰면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費</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게 나오는 것</span>과는 같지 않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대체로&#160;<span style="color: #0000ff;">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咳</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서 나오는 것</span>은&#160;<span style="color: #f200f2;">장</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臟</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에서 나오는 것이고, 장(臟)에서 나오면 그 래(來)가&#160;<span style="color: #f200f2;">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다.&#160;<span style="color: #0000ff;">한번 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는데 나오면</span>&#160;<span style="color: #f200f2;">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에서 나오는 것이고 후(喉)에서 나오는 것은 그 래(來)가&#160;<span style="color: #f200f2;">근</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00ff;">그 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來</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160;<span style="color: #f200f2;">내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內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이미 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甚</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 것이고,&#160;<span style="color: #0000ff;">그 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來</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근</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160;<span style="color: #f200f2;">경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經絡</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사이에 있는 것</span>에 불과(不過)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따라서&#160;<span style="color: #0000ff;">객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喀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나 타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唾血</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및 담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痰涎</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중에 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帶</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는 것이 보이면 대부분 해수(咳嗽) 발열(發熱) 기천(氣喘) 골증(骨蒸) 등이 증(證)이 없으니, 이로 그 경중(輕重)을 알 수 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를 치료(治)하는 방법(法)은&#160;<span style="color: #f200f2;">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로 인하면 또한&#160;<span style="color: #00cc00;">비폐</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脾肺</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의 화</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火</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를 약간 청</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淸</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는 것에 불과(不過)하고, 혹&#160;<span style="color: #f200f2;">노권</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勞倦</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으로 인하여 이르면 단지&#160;<span style="color: #00cc00;">양영</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養營</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보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補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기만 하면 저절로 낫지 않음이 없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200f2;">점차 노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勞損</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반드시 초(初)에&#160;<span style="color: #f200f2;">주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酒色</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노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勞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과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過度</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로 인하여&#160;<span style="color: #0000ff;">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痰</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중에 혈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血絲</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가 나타나니, 이는&#160;<span style="color: #f200f2;">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肝</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脾</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經</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근본</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당연히 해(咳)하거나 수(嗽)하기 전에 속히&#160;<span style="color: #00cc00;">조리</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調理</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하니,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생지황</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生地黃</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숙지황</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熟地黃</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천문동</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天門冬</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맥문동</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麥門冬</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산조인</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酸棗仁</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복신</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茯神</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천근</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33564;根</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패모</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貝母</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감초</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甘草</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속(屬)으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혹&#160;<span style="color: #f200f2;">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가 있으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황백</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黃栢</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지모</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知母</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를 가하여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반드시&#160;<span style="color: #00cc00;">근신</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勤愼</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에 유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加意</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거의 후환(後患)이 없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점차 심(甚)하게 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0000ff;">청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淸晨</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새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처음 기상</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起</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할 때 매번 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痰</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중에 담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淡紫</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한 응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凝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있어서 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塊</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나 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片</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항상 자주 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나타나면</span>&#160;이는 대부분&#160;<span style="color: #f200f2;">조바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操心</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으로 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를 동</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거나&#160;<span style="color: #f200f2;">사울</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思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많거나 과음</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過飮</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으로 말미암느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단,&#160;<span style="color: #0000ff;">해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咳嗽</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발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發熱</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등의 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없다면</span>&#160;곧 족히 염려(:慮)할 바는 아니니, 이는&#160;<span style="color: #f200f2;">락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絡血</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을 동</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그러한 것에 불과(不過)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오직&#160;<span style="color: #00cc00;">천왕보심단</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天王補心丹</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이나 이음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二陰煎</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가 가장 마땅한 바이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
<!-- -->
카페 게시글
잡증모07 (28-30)
13. 객혈(喀血) 타혈(唾血) 담연혈(痰涎血)에 대한 치(治)를 논(論)하다
코코람보
추천 0
조회 3
24.01.31 08:5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