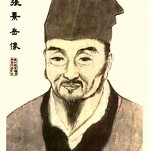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05. 고(古)의 서술(述)</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span data-ke-size="size18">중경(仲景)이 이르기를 &quot;사시(四時)의 기(氣)에 상(傷)하면 모두 병(病)이 될 수 있다. 겨울철(:冬時)의 엄한(嚴寒)에 중(中)하여 바로 병(病)하면 이를 명(名)하여 <span style="color: #ff0000;">상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傷寒</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한다. 바로 병(病)하지 않고 한독(寒毒)이 기부(肌膚)에 장(藏)하였다가 춘(春)에 이르러 변(變)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온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瘟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되고, 하(夏)에 이르러 변(變)하면 <span style="color: #ff0000;">서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暑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된다. <span style="color: #ff0000;">서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暑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열(熱)이 온병(溫)보다 극(極)히 더 중(重)한 것이다. 따라서 <span style="color: #0000ff;">신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辛苦</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삶이 혹독하다</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한 사람들</span>에게 춘하(春夏)에 온열(溫熱)의 병(病)을 많이 하니, 모두 겨울철(:冬時)에 한(寒)을 촉(觸)함으로 말미암은 소치(所致)이고, 시행(時行)의 기(氣)는 아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대개 <span style="color: #ff0000;">시행</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時行</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란 춘시(春時)에 응당 난(煖)하여야 하는데 다시 대한(大寒)하게 되거나, 하시(夏時)에 응당 대열(大熱)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대량(大凉)하거나, 추시(秋時)에 응당 양(凉)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대열(大熱)하거나, 동시(冬時)에 응당 한(寒)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대온(大溫)하는 것이다. 이는 <span style="color: #0000ff;">그 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時</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아닌데 그 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있는 경우</span>이다. 따라서 일 년(:歲) 중에서 <span style="color: #0000ff;">장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長幼</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의 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대부분 상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相似</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다</span>면 이는 시행(時行)의 기(氣)이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태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太陽</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의 중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中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span style="color: #ff0000;">갈</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26253;</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 그것이다. 그 사람이 한출(汗出) 오한(惡寒) 신열(身熱)하면서 갈(渴)하니, <span style="color: #00cc00;">백호가인삼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白虎加人蔘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이를 주(主)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태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太陽</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의 중갈</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中&#26253;</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span style="color: #0000ff;">신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身熱</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동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疼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서 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미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微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니, 이는 또한 <span style="color: #0000ff;">하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夏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냉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冷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상</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傷</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피</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皮</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속으로 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行</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는 소치</span>이다. <span style="color: #00cc00;">일물과체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一物瓜&#33922;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이를 토(吐)하게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태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太陽</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의 중갈</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中&#26253;</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span style="color: #0000ff;">발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發熱</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오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惡寒</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신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身重</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서 동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疼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그 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현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弦細</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규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33444;遲</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며 소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小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다 누면 오싹오싹</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27922;&#27922;然</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게 모</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용</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聳</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솟다</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수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手足</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역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逆冷</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며 조금이라도 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勞</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 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身</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바로 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구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口開</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전판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前板齒</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앞니 </span><span style="color: #0000ff;">8</span><span style="color: #0000ff;">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만약 발한(發汗)시키면 오한(惡寒)이 심(甚)하게 되고, 온침(溫針)을 가하면 발열(發熱)이 심(甚)하게 되며, 자주 하(下)를 시키면 임(淋)이 심(甚)하게 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장결고(潔古: 장원소)가 이르기를 &quot;정(靜)하다 이를 얻었으면 <span style="color: #ff0000;">중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中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고, 동(動)하다 이를 얻었으면 <span style="color: #ff0000;">중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中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다. <span style="color: #ff0000;">중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中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는 <span style="color: #f200f2;">음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陰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고, <span style="color: #ff0000;">중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中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span style="color: #f200f2;">양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진무택(陳無擇)이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暑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은 심(心)으로 잘 귀(歸)하니, <span style="color: #f200f2;">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心</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 이를 중(中)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열민(&#22094;悶) 혼부지인(昏不知人)하고, <span style="color: #f200f2;">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으로 들어가면 현훈(眩暈) 완비(頑痺)하며, <span style="color: #f200f2;">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脾</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로 들어가면 혼수(昏睡) 불각(不覺)하고, <span style="color: #f200f2;">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肺</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로 들어가면 천만(喘滿) 위벽(&#30207;&#36484;)하며, <span style="color: #f200f2;">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으로 들어가면 소갈(消渴)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대개 중갈(中&#26253;)로 사(死)하려고 하면 치(治)할 때 절대로 냉(冷)을 쓰면 안 되고, 오직 <span style="color: #00cc00;">온양</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溫養</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이 마땅하다. 길을 가는(:道途) 중이라서 탕(湯)이 없으면 곧 <span style="color: #00cc00;">열</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熱</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한 토</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土</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로 제중</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臍中</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을 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29096;</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고 다시 그 토(土)에 오줌(:溺)을 누고는 이를 취하여 제상(臍上)을 덮으니, 그 대개(槪)를 알 수 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대개 중서(中暑)를 각(覺)하면 급히 <span style="color: #00cc00;">생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生薑</span><span style="color: #00cc00;">) </span>큰 덩어리(:大塊) 하나를 씹고(:嚼) 수(水)로 송하(送下)한다. 만약 이미 미민(迷悶)하면 <span style="color: #00cc00;">대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大蒜</span><span style="color: #00cc00;">) </span>큰 쪽(:大瓣) 하나를 씹고(:嚼) 수(水)로 송하(送下)한다. 만약 씹을(:嚼) 수 없으면 수(水)에 갈아서(:硏) 이를 관(灌)하면 즉시 깨어난다(:腥).&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대씨(戴氏)가 이르기를 &quot; 하월(夏月)에 졸도(卒倒) 불성인사(不省人事)하면 이를 명(名)하여 <span style="color: #ff0000;">서풍</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暑風</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한다.&quot; 하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왕절재(王節齋)가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를 치료(治)하는 법(法)은 <span style="color: #00cc00;">청심</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淸心</span><span style="color: #00cc00;">) </span><span style="color: #00cc00;">이소변</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利小便</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는 것이 가장 좋다. <span style="color: #ff0000;">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는 기(氣)를 상(傷)하니, 마땅히 <span style="color: #00cc00;">진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眞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를 보</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는 것이 요(要)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또 오한(惡寒)하고 혹 사지(四肢)가 역랭(逆冷)하며 심(甚)하면 미민(迷悶) 불성(不醒)하면서 곽란(&#38669;亂) 토리(吐利) 담체(痰滯) 구역(嘔逆) 복통(腹痛) 사리(瀉利)하면 이는 <span style="color: #ff0000;">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사람을 상(傷)한 것이 아니고, <span style="color: #ff0000;">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로 인하여 저절로 이른 병(病)이다. <span style="color: #ff0000;">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로 인하여 얻은 것이므로 <span style="color: #ff0000;">서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暑病</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치법(治法)은 다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만약 <span style="color: #0000ff;">토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吐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의 침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沈微</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 양약(凉藥)을 쓸 수 없고, <span style="color: #00cc00;">부자대순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附子大順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이나 혹 부자이중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附子理中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에 작약</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芍藥</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가하여 쓸 수 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만약 하월(夏月)에 냉물(冷物)을 다식(多食)하거나 다수(茶水)를 과음(過飮)하면 <span style="color: #f200f2;">비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脾胃</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를 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토사(吐瀉) 곽란(&#38669;亂)에 이른다. 따라서 <span style="color: #f200f2;">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를 치료(治)하는 약(藥)은 대부분 마땅히 <span style="color: #00cc00;">온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溫脾</span><span style="color: #00cc00;">) </span><span style="color: #00cc00;">소식</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消食</span><span style="color: #00cc00;">), </span><span style="color: #00cc00;">치습</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治濕</span><span style="color: #00cc00;">) </span><span style="color: #00cc00;">이소변</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利小便</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한다. 의사(醫)는 이러한 의미(意)를 잘 알아야(:識) 함을 요(要)한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설립재(薛立齋)가 이르기를 &quot;생각하건대 동원(東垣) 선생(先生)이 이르기를 &#39;<span style="color: #ff0000;">서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暑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시(時)에는 무병(無病)하던 사람이 서열(暑熱)을 피(避)하려고 심당(深堂: 집 깊은 곳)이나 대하(大廈: 큰 집)에서 양(凉)을 납(納)하여 얻은 것이면 명(名)하여 <span style="color: #ff0000;">중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中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라 한다. 그 병(病)은 반드시 <span style="color: #0000ff;">두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頭痛</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오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惡寒</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신형</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身形</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구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拘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며 지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肢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동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疼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번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煩熱</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무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無汗</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한다. 방실(房室)의 음한(陰寒)한 기(氣)가 알(&#36943;)하여 주신(周身)의 양기(陽氣)가 신월(伸越)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span style="color: #00cc00;">대순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大順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열약(熱藥)으로 이를 주(主)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만약 행인(行人)이나 혹 농부(農夫)가 <span style="color: #f200f2;">일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日中</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서 노역</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勞役</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얻은 것이면 명(名)하여 <span style="color: #ff0000;">중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中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한다. 그 병(病)은 반드시 <span style="color: #0000ff;">두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頭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으로 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苦</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조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躁熱</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오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惡熱</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기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肌熱</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대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大渴</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한설</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汗泄</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나동</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懶動</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한다. 이는 천열(天熱)이 외(外)에서 폐기(肺氣)를 상(傷)한 것이다. <span style="color: #00cc00;">창출백호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蒼朮白虎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양제(凉劑)로 이를 주(主)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만약 사람의 원기(元氣)가 부족(不足)하여 앞의 약(藥)을 써도 응(應)하지 않으면 마땅히 <span style="color: #00cc00;">보중익기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補中益氣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이를 주(主)한다.&#39; 하였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대체(:大抵)로 하월(夏月)은 양기(陽氣)가 외(外)에 부(浮)하고 음기(陰氣)는 내(內)에 복(伏)한다. 만약 사람이 음식(飮食) 노권(勞倦)으로 <span style="color: #f200f2;">중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中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를 내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內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거나 혹 혹서(酷暑)에 노역(勞役)을 하여 <span style="color: #f200f2;">양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를 외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外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대부분 이를 앓게 된다(:患). 그 치법(:法)은 마땅히 <span style="color: #00cc00;">원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元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를 조보</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調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는 것을 위주(爲主)로 하고 해서(解暑)를 좌(佐)로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만약 <span style="color: #ff0000;">중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中暑</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면 곧 <span style="color: #f200f2;">음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陰寒</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증(證)이니, 그 법(法)은 마땅히 양기(陽氣)를 보(補)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해서(解暑)를 조금 좌(佐)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철(先哲)들은 <span style="color: #00cc00;">건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乾薑</span><span style="color: #00cc00;">) </span><span style="color: #00cc00;">육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肉桂</span><span style="color: #00cc00;">) </span><span style="color: #00cc00;">부자</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附子</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를 많이 썼으니, 이는 내경([內經])의 &#39;시(時)를 버리고 증(證)을 따른다.&#39;는 것을 유추(:推)한 좋은 치법(法)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요즘 서증(暑證)을 앓다가(:患) 죽은(:歿) 사람은 그 수족(手足) 지갑(指甲)이나 혹 지체(肢體)가 청암(靑&#40687;: 검푸르다)한데, 이는 모두 그 원인(因)을 궁구(究)하지 않아 그 내(內)를 온보(溫補)하지 않으면서 <span style="color: #00cc00;">향유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香&#34231;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를 널리 사용(用)한 잘못(:誤)이다.&quot; 하니라.</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또 이르기를 &quot;앞의 증(證)은 당연히 중서(中暑)과 중갈(中&#26253;), 맥허(脈虛)와 맥침(脈沈), 무한(無汗)과 유한(有汗), 발열(發熱)과 불열(不熱), 작갈(作渴)과 불갈(不渴), 혹사(或瀉)와 불사(不瀉), 음한(飮寒)과 음열(飮熱)을 분별(分別)하여 그 음양(陰陽) 허실(虛實)을 변(辨)하여야 하니, 한량(寒凉)한 방제(劑)를 두루 투여(投)하면 안 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대개 하월(夏月)에는 <span style="color: #0000ff;">복음</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伏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이 내(內)에 있다고 하여 고인(古人)들은 <span style="color: #00cc00;">부자대순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附子大順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를 써서 <span style="color: #00cc00;">양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陽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를 온보</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溫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였으니, 여기에 지(旨)가 있도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어찌하여 요즘 사람들(:今人)은 노약(老弱)한 자가 하월(夏月)에 이르러 <span style="color: #0000ff;">식소</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食少</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체권</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體倦</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발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發熱</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작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作渴</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혹 토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吐瀉</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복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腹痛</span><span style="color: #0000ff;">) </span><span style="color: #0000ff;">두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頭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의 제증(諸證)을 앓는데(:患) 도리어 <span style="color: #00cc00;">향유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香&#34231;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복용(服)하여 다시 원기(元氣)를 상(傷)하게 하니, 서증(暑證)을 불러들이지(:招引) 않음이 없고, 또 일어나지(起) 못하게 하는가?</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cc00;">청서익기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淸暑益氣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경우에도 그 내(內)에는 택사(澤瀉) 창출(蒼朮) 황백(:黃栢)의 종류(類)를 사용(用)하였는데, 반드시 살펴서 습열(濕熱)의 옹체(壅滯)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를 사용(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그 음(陰)을 휴손(虧損)하게 되니, 당연히 잘 살펴서 사용(用)하여야 한다.&quot; 하니라.</span></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