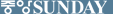|
.
망자의 극락환생 빌며 화장한 유골 갈무리 고려사의 재발견 명품 열전 ⑤ 석관(石棺)
청자나 대장경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려문화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문화재가 석관(石棺)이다. 석관은 1916년 개성 개풍군에 위치한 고려 문신 송자청(宋子淸: ?~1198년)의 분묘에서 처음 출토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90㎝, 너비 46㎝, 높이 45㎝, 두께 3㎝ 정도 크기다. 망자의 시신을 담기 위해 사람 키보다 크게 만든 오늘날의 석관과는 다른 크기와 용도임을 알 수 있다. 송자청의 석관에선 묘지명과 부장품도 발굴됐다(『조선고적도보』 7집).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약 60점의 고려 석관도 모두 이 정도 크기다. 전부 개성 일대에서 출토된, 고려의 문화재다. 석관들이 만들어진 형식도 한결같다. 천판(天板: 덮개)과 지판(地板: 밑부분)으로 구성된 두장의 판석(板石)에다 지판 위에 설치돼 천판을 전후좌우에서 지탱하는 4장의 판석 등 모두 6장의 판석으로 조립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고려 석관은 조립식 석관으로 불린다. 석관은 고려 장례문화와 관련된 유물이다. 석관을 통해 당시 장례 풍습을 읽을 수 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까? 석관과 함께 출토된 송자청의 묘지명엔 다음 같은 기록이 있다.
“1174년(명종4) 서경의 반역자 조위총(趙位寵)이 공격하자, 공(송자청)은 1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먼저 나가 화살을 맞으면서 싸워 격파했다. (중략) 공은 1195년(명종25) 3품의 벼슬로 은퇴했고 1198년(신종1) 12월 20일 병이 들어 집에서 돌아갔다(숨졌다). 영×산(靈×山) 서쪽에 장례를 지냈다가, 얼마 뒤 다시 무덤자리를 점쳐 유골을 안장했다.” (송자청의 묘지명) 망자가 숨진 뒤 사흘간을 전후해 빈소에서 조문을 받은 뒤 화장 혹은 매장을 하는 요즘의 장례 형식을 단장(單葬)이라 한다. 반면 위의 기록에서는 송자청의 장례를 치른 뒤 얼마 후 다시 무덤자리를 정해 유골을 안장했다고 한다. 요즘의 장례와는 다른 형식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다음의 기록이다. “공은 향년 83세다. 올해(*1144년) 봄 2월 을미일(*14일)에 집에서 돌아가셨으며, 3월 10일 신유일에 정주 땅 동쪽 기슭에 화장했다. 임금이 듣고 몹시 슬퍼하며 특별히 부의를 더하게 하고 조서를 내려 대부(大傅: 정1품)라는 벼슬을 내렸다. 가을 8월 18일 정유일에 이곳에 유골을 묻고 묘지명을 짓는다.”(허재 許載: 1062~1144년: 묘지명)
오랜 기간 제례 올려야 망자에 대한 예의 고려 중기의 문신 허재는 숨진 뒤 26일 만에 화장됐고, 그 뒤 5개월 만에 화장으로 수습된 유골이 다시 매장된다. 사망→화장→유골 수습과 안치→매장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이런 고려의 장례 형식을 ‘복장’(複葬)이라 한다. 여러 차례 장례를 치렀다는 뜻이다. 복장은 1·2·3차 장(葬)이라는 3단계의 의식을 치른다. 사망 후 빈소를 차려 손님을 맞는 빈례(殯禮)에 이어 화장(火葬)이나 매장(埋葬)을 통해 탈육(脫肉)하는 과정을 거쳐 유골을 수습하는 단계가 1차 장이다. 묘지명 기록에 따르면, 사망 후 대체로 5일에서 29일 사이에 화장을 한다. 화장 외에 시신을 땅에 매장해 탈육하는 경우 약 8~20개월이 걸린다. 12세기 중반부터 불교의 영향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이 보편화된다. 이어 유골을 수습한 뒤 사찰 등에 임시로 안치해 제사를 지내는 단계를 2차 장이라 한다.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은 4개월에서 6년4개월까지 차이가 많다. “옛날 조상을 장례 지낼 때 날을 멀리 받는 것(遠日: 오랜 기간의 장례)이 예의다. 사대부가 3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예법이 아니다.”(『고려사』 권85 형법 금령 충숙왕 복위8년(1339)조) 고려 장례 풍습은 이렇게 오랜 기간 제례를 올리는 것을 망자에 대한 예의로 생각했다. 이 기간 동안 망자의 안식처이자 후손의 발복지(發福地)인 길지를 택하고, 분묘를 조성하며 석관과 묘지명 및 부장품을 준비한다. 하지만 유골을 사찰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요즈음 세상의 도가 쇠퇴해 풍속이 경박하다. (중략) 부모의 유골을 사찰에 임시로 모셔두고 수년 동안 매장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 관리들은 이를 조사해 죄를 줄 것이며, 만일 가난해 매장하지 못한 자는 관에서 비용을 지급하라.” (『고려사』 권16 인종 11년(1133) 6월) 복장을 치르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 탓에 유골을 방치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 장례를 마무리하는 관행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찰에 안치된 유골은 석관에 담겨 매장됨으로써 장례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이를 3차 장이라 한다. 석관은 이같이 복장식 장례에 필요한 물품이었다. 송자청의 석관 크기(90×46×45㎝)가 당시 표준이었던 것으로 보아, 석관은 수습된 망자의 유골을 담는 용기와 부장품을 담는 데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관은 화장식 장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일신라 문무왕(661~680년 재위)은 자신의 장례를 화장으로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때부터 화장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다. 원래 화장은 불교와 관계없이 신석기 시대에 발생해 청동기·철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일대에서 성행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행해진 화장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삼국·통일신라시대를 거쳐 불교가 발달된 고려 때 성행했다. 고려 때 화장은 승려뿐 아니라 왕족·귀족과 민간 일부 계층까지 확산됐다. 석관은 이런 과정에서 부각된 문화재다. 고려 때 왜 석관 문화가 성행했느냐는 물음은 당시 왜 화장을 했느냐는 물음과 통한다. 화장에 대한 고려인의 생각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장(葬)’이란 감춘다(藏)는 뜻이다. (망자의) 해골을 감추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근래 불교의 다비법(茶毗法*화장)이 성행해 사람이 죽으면 모발과 피부를 태워 해골만을 남긴다. 심한 경우는 뼈를 태우고 재를 날려 물고기와 새에게 베푼다. 이렇게 해야 망자가 하늘에 가서 다시 태어나 서방세계(*서방정토의 극락)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고려사』 권85 형법 금령조 공양왕 원년(1389)조) 관료·지배층 문화 … 서민들은 매장·풍장 모발과 피부는 물론 뼈까지 태우는 화장을 해야만 망자가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석관은 망자를 서방정토로 이끌어주는 도구였던 것이다. 그래서 화장 후 유골을 수습한 뒤 일정기간 안치해 제례를 올린 후 다시 석관을 만들어 유골을 정성스럽게 담아 매장했다. 그렇지만 화장이 고려의 일반적인 장례 풍습은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 장례 도구를 갖추지 못하면 들판 가운데 버려두고, 봉분도 하지 않고 비석도 세우지 않았다. 개미, 까마귀, 솔개가 파먹는 대로 놓아두어도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다.” (『고려도경』 권22 잡속(雜俗)조) 이 글에서 드러나듯 고려의 일반 주민은 시신을 바로 땅에 매장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조차 어려워 들판에 시신을 놓아두는 풍장(風葬) 같은 ‘단장’(單葬)을 했다. 묘지명의 주인공이 왕실·관료층과 그 가족이듯이, 석관도 관료·지배층 장례문화의 일부였다. 석관은 미술사적인 가치를 지닌다. 석관의 네 벽은 관의 좌우에 해당하는 길이가 긴 장벽(長壁)과, 석관의 앞뒤에 해당하는 길이가 짧은 단벽(短壁)으로 구성된다. 석관의 네 벽 외면에는 주로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져 있다. 네 벽 가운데 2장의 장벽 좌우에 각각 청룡(靑龍*좌청룡)과 백호(白虎*우백호)를, 나머지 2장의 단벽 전후에 각각 주작(朱雀*남주작)과 현무(玄武*북현무)를 선으로 깊이 새겼다. 또는 돋을새김을 했다. 사신(四神)은 사방을 수호하는 방위신이다. 석관을 매장할 때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도 했다. 동서남북을 상징한 청백주현(靑白朱玄)의 네 색깔은 중국 황제가 관리를 지방에 파견할 때 사방의 방향에 따라 각각 해당 색깔의 흙(*色土)를 내려준 데서 연유했다. 사신도는 석관 내부를 망자의 소우주로 간주하고, 망자의 안식을 위해 석관의 외면에 사신을 배치한 그림이다. 그 밖에 연꽃무늬(*蓮花文), 당초문(唐草文), 비천상(飛天像), 봉황문(鳳凰文), 구름무늬(雲文), 12지신상, 모란무늬 등이 그려진 경우도 있다. 석관의 뚜껑과 밑판의 판석에도 테두리를 선으로 새긴 뒤 위와 같은 그림을 새겨 넣었다. 석관의 장식은 남북조 이후 중국 역대 왕조와 거란의 석관에 새겨진 그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석관의 사신도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왕릉의 12지신상을 계승한 것이다. 또 석관에 새겨진 장식기법은 고려의 도자기와 금속용품, 부도 등의 장식문양을 계승했다. 고려 예술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또 석관의 양식은 거슬러 올라가보면 화장유골을 담은 삼국시대의 ‘골호’(骨壺*뼈항아리)를 계승하고 있다. 골호는 돌덩이 속을 파내어 화장유골을 담고, 그 바깥(*石函이라 함)을 여러 형태의 문양으로 다듬은 것이다. 석관은 내부에 골호와 같은 기능인 망자의 화장유골을 담은 그릇(*주로 나무상자)이 있다. 이와 함께 청자, 동전, 숟가락 등 부장품이 들어있고, 그 외부에는 사신도를 새겨 골호보다 양식적으로 더 발달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칠공예·나전기술의 융합 … 불교용품 주로 제작 고려사의 재발견 명품 열전 ⑥ 나전칠기
고려문화의 또 다른 정수를 보여주는 명품은 나전칠기(螺鈿漆器)다. 현재 16점이 전해진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1점을 빼곤 모두 해외(일본 10점, 미국 3점, 유럽 2점)에 유출돼 있다. 나전칠기는 칠공예(漆工藝)와 나전 기술이 합쳐진, 이른바 기술의 융합에 의해 생산된 명품이다. 나전 기술은 원래 중국 당(唐)나라에서 건너왔다. 이와 달리 목재제품 등에 옻칠을 입히는 칠공예 기술은 이른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축적돼왔다. 우리나라 칠공예의 장식기법이 주로 자개를 이용해왔기 때문에 칠공예 기술과 나전기술을 분간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나전칠기가 단일한 기술로만 제작된 것이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것이다. 또한 고려의 나전기술은 중국과 달랐다. 당나라의 나전은 자단(紫檀·동남아 등지에서 식생한 나무)과 같이 단단하고 무늬가 아름다운 나무에 바로 나전을 새겨 넣었다. 그래서 목지나전(木地螺鈿)이라 한다. 반면에 고려의 경우 경전·염주 등을 담는 나무상자에 굵은 삼베를 바르고 옻칠을 한다. 그 위에 잘게 썬 나전을 새겨 넣은 후 다시 옻칠을 덧입힌다. 그런 후 나전 무늬에 덮인 칠을 벗겨내고 광 내기 과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됐다. 이렇게 나전 기술과 칠공예 기술이 결합돼 나전칠기라고 했다.
대표작은 나전대모국화당초문 염주합 두 가지 기술의 융합으로 제작된 나전칠기는 제작기법상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1㎝ 이내로 자른 조개 조각으로 무늬를 엮는다. 이를 절문(截文·끊음질 무늬)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흰빛에 일곱 가지 색이 어른거리는 조개 특유의 색깔이 드러난다. 둘째, 바다거북 등딱지인 대모(玳瑁)의 뒷면을 채색해 나전과 함께 그릇 표면에 무늬를 놓는다. 조개와 붉은빛으로 채색된 대모의 색깔이 어울려 환상적인 색감을 보여준다. 셋째, 잘게 쪼갠 자개들을 정교하게 새긴 꽃이나 넝쿨무늬 주변에 은(銀)·동(銅)으로 꼰 가느다란 금속선을 둘러 꽃줄기와 넝쿨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무늬 구성에 디자인적 질서를 부여한다. 고려 나전칠기의 화려하면서도 전아(典雅)한 멋은 이 세 가지 기술이 결합된 무늬의 아름다움에 있다.
하지만 나전칠기의 수요가 많아져 대모를 조달하기 힘들어지자 대모 장식은 점차 사라진다. 초기 작품(11~12세기)에 대모의 장식이 많이 나타나는데, 현재 전해지는 나전칠기의 종류는 주로 불교 의식과 관련된 제품이다. 대장경 등을 담는 나전경함(經函)이 전체 16점 가운데 9점으로 가장 많다. 나전칠기의 가장 아름다운 대표작인 나전대모국화당초문(*넝쿨무늬) 염주합(사진) 역시 불교 의식용 제품이다. 이처럼 나전칠기는 당시 성행한 불교 문화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제작됐다. 1272년(원종13) 원나라 황후가 대장경을 담기 위해 나전으로 장식된 상자를 요구하자, 고려는 전함조성도감(鈿函造成都監)을 설치한 것(『고려사』 권27 원종 13년 2월조)이 그 증거다(유홍준,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2』, 2012년). 무늬 주변에 금속 선(線)을 넣는 기법은 고려 공예예술을 상징하는 기법이다. 금속공예에선 금속 표면에 무늬를 깊게 파낸 다음 가느다란 금실이나 은실을 메워 넣는 금(金) 입사(入絲), 은(銀) 입사 기법으로 나타난다. 도자공예에선 도자기 표면에 문양을 새기고 그 속에 검정·빨강·하양의 흙을 메운 뒤 구워 특유의 문양을 드러내는 상감기법으로 구현됐다. 고려의 나전칠기는 이같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칠공예 기술에다 조개를 잘게 썰어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 넣는 정교한 나전 기술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명품이다.
“(고려에서) 그릇에 옻칠하는 기술은 정교하지 못하지만, 나전 기술은 세밀하여 귀하다고 할 수 있다” (地少金銀 而多銅 器用漆作不甚工 而螺鈿之工 細密可貴)(『고려도경』(1123년) 권23 토산조).
고려에 온 송나라 사신 서긍은 위 기록과 같이 칠공예와 나전 기술을 분리해 평가했다. 실제로 고려는 왕실의 기물을 관장하던 관청 중상서(中尙署)에 나전장(螺鈿匠)과 칠장(漆匠)을 분리시켜 관리했다 (『고려사』 권80 식화지). 서긍은 또한 고려에선 칠공예보다 나전 기술이 더 발달했다고 했다. 그의 지적은 사실 중국에 비해 화려하게 옻칠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데 불과하다. 실제로 그는 고려에서 옻칠공예가 성행한 사실을 같은 책 『고려도경』에 기록하고 있다. 즉 ‘쟁반과 소반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 옻칠을 했으며’(『고려도경』 권33 궤식(饋食)조), ‘왕과 관료들이 사용한 붉은 칠을 한 소반(丹漆俎)을 사신에게도 사용했다’(권28 단칠(丹漆)조)고 했다. 당시 식생활 전반에 쟁반·소반 등 칠공예 제품이 널리 쓰였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원 왕실도 옻칠과 匠人 보내달라 요구 목재 제품에 옻칠을 하면 방수 효과와 함께 쉽게 부패되거나 썩는 것을 예방하고 그릇의 아름다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옻칠공예는 목기(木器)에 주로 활용되었다. 이규보 역시 다음 기록과 같이 술병에 옻칠을 하여 사용했다. “박으로 병을 만들어 술 담는 데 사용한다(自瓠就壺 貯酒是資). 목은 길고 배는 불룩하여, 막히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다(頸長腹? 不咽不歌). 그래서 내가 보배로 여겨, 옻칠을 하여 광채 나게 했다(我故寶之 漆以光之)”(『동국이상국집』 권19 잡저 칠호(漆壺)). 우리나라에서 옻칠 기술은 청동기 시대 이후 유물에서 칠 제품이 출토될 정도로 일찍부터 발달돼왔다. 신라 때는 옻칠 공예를 전담한 부서인 칠전(漆典)이 있었다. 또 그릇에 칠을 해 장식한다는 뜻으로 식기방(飾器房)이라 했다(『삼국사기』 권39 잡지). 앞서 언급했듯이 고려 때도 중앙관청에 칠장(漆匠)을 소속시켜 칠공예 제품을 생산하게 했을 정도로 옻칠공예가 성행했다. 전국에 닥나무(楮), 잣나무(栢), 배나무(梨), 대추나무(棗) 등과 함께 옻나무(漆)를 심게 해 옻을 계획적으로 생산했다(『고려사』 권79 식화지 명종 18년(1188) 3월조). 그래선지 일찍부터 옻칠의 품질과 제작 기술이 뛰어났다. “묵구(墨狗) 등 7명이 원나라에 금칠(金漆)을 보내라는 황제의 명령서를 갖고 왔다. 국왕(*원종)은 ‘우리나라가 비축한 금칠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할 때 모두 없어졌고, 생산지인 남쪽 섬은 요즘 역적(*삼별초 군대)이 왕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틈을 타 생산해 보내겠으며, 우선 갖고 있는 열 항아리를 보냅니다. 옻칠의 액을 짜는 장인은 직접 생산지에서 징발하여 보내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고려사』 권27 원종 12년(1271) 6월조). 원나라가 고려의 옻 품질이 뛰어나고 그것이 많이 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옻칠과 함께 장인을 함께 보내줄 것을 요구한 기록이다. 개경 환도 직후 옻칠이 많이 생산된 남쪽 섬 지역이 삼별초 군대에 점령되어 제대로 생산될 수 없었던 사정도 알려준다. 고려는 위 기록대로 삼별초 난이 진압된 2년 후인 1276년(충렬왕2) 원나라에 황칠(黃漆)을 공납했다. 원나라가 요구한 금칠은 황칠의 다른 이름이다. 원래 칠에는 옻칠과 황칠 두 가지가 있다. 옻칠은 옻나무에서 채취한 짙은 적갈색 진액이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옻은 황칠나무에서 주로 채취한 황금 색깔의 진액이다. 서긍도 당시 ‘나주지역에 황칠이 많이 생산되어 왕실에 공납되었다’라고 기록했다(『고려도경』 권23 토산조). 조선 후기에 이수광은 ‘고려의 황칠은 섬에서 생산되는데, 6월에 채취하였다’(『지봉유설』 권19)라고 전한다. 황칠은 부와 권력의 상징인 노란색을 띠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또한 금 색깔과 같다고 해서 금칠이라 불렀던 것이다.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황칠나무는 남해안과 일대 섬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토종의 늘 푸른 넓은잎나무다. 금빛을 띠면서 나뭇결을 살려내는 화려한 맛이 있어 왕실 등에서 선호했다(박상진, 『역사가 새겨진 나무이야기』, 2004). 기병用 말 안장·언치도 나전으로 장식 서긍은 앞에서 본 것처럼 “고려의 나전 기술은 세밀하여 귀하다”고 극찬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 나전 제품은 모두 목재제품을 이용한 것인데, 서긍이 극찬한 나전은 다른 제품이었다. 즉 그는 ‘기병이 사용하는 안장과 언치(안장 깔개)는 매우 정교하며 나전으로 장식하였다(騎兵所乘鞍?極精巧 螺鈿爲鞍)’(『고려도경』 권15 기병마(騎兵馬)조)라고 말해 말 안장에 새겨진 나전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1080년(문종34) 7월 고려는 송나라에 나전으로 장식한 수레(螺鈿裝車) 1대를 조공했다(『고려사』 권9, 1243년(고종32). 무신정권의 권력자 최이는 왕실 사람과 재추(*고위관료)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커다란 그릇을 나전으로 장식했다고 한다(『고려사』 권129 최이 열전). 즉 나전 기술은 목재 제품뿐 아니라 가죽 수레와 그릇 등 다양한 제품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나전은 선물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예종 때 문신 문공인(文公仁·?∼1137)은 거란에 사신으로 가서 나전 그릇을 선물로 많이 주었는데, 이후 거란의 사신이 고려에 오면 항상 나전 그릇을 요구하는 폐단을 낳았다고 한다(『고려사』 권125 문공인 열전). 고려에서 나전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외국에까지 널리 이름을 떨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전 기술 역시 칠공예 기술과 함께 발달된 것이다. 나전칠기는 이같이 칠공예 기술과 나전 기술이 함께 발달해야 생산될 수 있다. 어느 한쪽 기술만 발달하면 명품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제품이 송·거란·원나라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것은 당시 공예 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끼쳐 상감청자·고려지(高麗紙)·대장경을 명품의 반열에 올려놓게 했다. 이 점에서 고려왕조는 진정한 문화·기술의 강국이었다. 이외에도 고려선(高麗船)·금속활자·불화(佛畵) 등 수준 높은 명품 문화재를 낳게 했다.
박종기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역사와 현실의 일체화,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역사학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안정복, 고려사를 공부하다』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고려의 부곡인, <경계인>으로 살다』 등이 있다.
|
출처: 마음의 정원 원문보기 글쓴이: 마음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