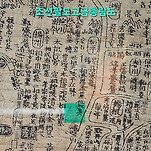<p><span data-ke-size="size14"> 죽애공파보 기록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음.</span></p><p>&#160;</p><p><span style="color: #666666;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 19세 </span><span style="color: #0078cb;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20"><b>胤元</b></span><span style="color: #0078cb;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b>임윤원</b></span><span style="color: #666666;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 : 1645-1712(인조-숙종) </span><span style="color: #830041;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23">大司諫公</span><span style="color: #666666;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 향년 68세 자는 士長사장이시다. </span></p><p><span style="color: #666666;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현종조 1669년 진사 합격(24세), 숙종 13년 1687년 알성시 병과로 급제(42세) </span></p><p><span style="color: #666666;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官 통정대부 </span><span style="color: #ff65a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사간원 대사간</span><span style="color: #666666;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 贈 자헌대부 </span><span style="color: #ff65a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이조판서</span></p><p>&#160;</p><p><span style="color: #666666;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관직현황]</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11년 1685.6.2.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광릉 참봉</span><span data-ke-size="size18">(음직)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13년 1687.10.14.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가주서</span><span style="color: #00a84b;" data-ke-size="size18">(주1)</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13년 1687.12.27.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부사정</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14년 1688.3.14.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가주서</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15년 1689.9.12.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전적</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15년 1689.9.13.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병조 좌랑</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15년 1689.11.15.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병조 정랑</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16년 1690.2.20.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황해 도사</span><span style="color: #00a84b;" data-ke-size="size18">(주2)</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17년 1691.5.22.</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b>지평</b></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17년 1691.7.16.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서흥 현감</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0년 1694.10.20.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b>필선</b></span><span style="color: #00a84b;" data-ke-size="size18"><b>(주3)</b></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2년 1696.3.15.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濟用正제용정</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2년 1696.6.2.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사복시 정</span><span style="color: #00a84b;" data-ke-size="size18">(주4)</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2년 1696.7.6.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司成사성</span><span style="color: #00a84b;" data-ke-size="size18">(주5)</span><span style="color: #00a84b;"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2년 1696.7.13. 겸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b>장령</b></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2년 1696.7.25. 청</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 사은사(</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b>서장관</b></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3년 1697.1.6. 겸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養賢庫主 簿양현고주 부</span><span style="color: #00a84b;" data-ke-size="size18">(주6)</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span><span data-ke-size="size18">종 23년 1697.2.4.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부수찬</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3년 1697.3.5.</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 수찬</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3년 1697.4.12.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b>교리</b></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3년 1697.5.20.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b>보덕</b></span><span style="color: #00a84b;" data-ke-size="size18"><b>(주7)</b></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3년 1697.6.16.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수찬</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3년 1697.9.28.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보덕 </span><span data-ke-size="size18">(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3년 1697.10.10.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부수찬</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3년 1697.10.23.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보덕</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3년 1697.11.12.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부교리</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4년 1698.2.3.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b>집의</b></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4년 1698.3.13.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掌樂正장악정</span><span style="color: #00a84b;" data-ke-size="size18">(주8)</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4년 1698.3.24.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암행어사</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4년 1698.4.13.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교리 </span><span data-ke-size="size18">(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4년 1698.4.27.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b>헌납</b></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4년 1698.6.6.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수찬</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6년 1700.4.18.</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 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6년 1700.7.06.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6년 1700.10.19.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7년 1701.2.25.</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b>강원도관찰사 </b></span><span data-ke-size="size18">(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span></p><div class="imagegridblock" data-ke-type="imageGrid"><div class="image-container"><span data-url="https://t1.daumcdn.net/cafeattach/1ZbpA/ab42f02fac08002c618ac203981453c5f126ab33" data-origin-width="400" data-origin-height="712" style="width:24.97%; margin-right: 10px;"><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bpA/ab42f02fac08002c618ac203981453c5f126ab33" class="txc-image-grid"></span><span data-url="https://t1.daumcdn.net/cafeattach/1ZbpA/5f1deaf0cc391fc2e2c885b36d9e4c570be463f6"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474" style="width:75.03%;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bpA/5f1deaf0cc391fc2e2c885b36d9e4c570be463f6" class="txc-image-grid"></span></div><div class="figcaption">前감사 유이복과 사돈관계로 강원감사 應避之嫌 上疏(유이복의 형 유이정이 아들 임수적의 장인)</div></div><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 data-ke-size="size18">숙종 27년 1701.5.20.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병조 참의</span><span style="color: #00a84b;" data-ke-size="size18">(주9)</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7년 1701.6.6.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안악 군수</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8년 1702.6.24.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병조 참의</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8년 1702.윤6.29.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8년 1702.8.9.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병조 참의</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8년 1702.12.20.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승지 </span><span data-ke-size="size18">(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9년 1703.5.11.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공조참의</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9년 1703.6.25.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29년 1703.8.16.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b>황해도관찰사</b></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0년 1704.10.4.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1년 1705.1.8.</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 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1년 1705.2.7.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공조 참의</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1년 1705.2.21.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1년 1705.윤4.14.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31년 1705.7.23.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병조 참지</span><span style="color: #00a84b;" data-ke-size="size18">(주10)</span><span style="color: #00a84b;"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2년 1706.3.17.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2년 1706.7.24.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b>대사간</b></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2년 1706.9.20.</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 우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2년 1706.11.21.</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 대사간</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3년 1707.3.22.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3년 1707.4.1.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대사간</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6년 1710.1.10.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6년 1710.5.26.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예조 참의</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li><li><p><span data-ke-size="size18">숙종 36년 1710.10.27.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8">병조 참지</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span></p><span data-ke-size="size18"></span></li></ul></li></ul><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 관련 기록 2,916건</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 승정원일기上 특이 기록</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 - 본인의 </span><span data-ke-size="size18"><u>遞職체직상소</u></span><span data-ke-size="size18">는 재임기간중 총 19회(숙종17년 시작으로 36년 7월12일까지)</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u> 三度呈辭삼도정사</u></span><span data-ke-size="size18">는 숙종 27년 2월 부터 서거하시는 전월(숙종38년 6월)까지 총 10회</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hr data-ke-style="style8"><p>&#160;</p><p>&#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8a837e;" data-ke-size="size16">(주1)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u>가주서</u></span><span style="color: #8a837e;" data-ke-size="size16"> :</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 두었던 정칠품(正七品)의 임시 관직이다. 정원은 1원이고, 2원의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주서(注書</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七品)가 유고시에 임시로 차출, 임명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연산군 때 처음으로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가설주서(假說注書)</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2원을 둔 이후, 정원 2원의 가설에 결원이 생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가주서</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를 임명하여 주로 『승정원일기』를 기록, 정리하는 일을 대신하였다. 또 선조 때에는 승정원에 별도의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七品) 1명을 정식으로 두고 비변사(備邊司)와 국옥(鞫獄)에 관계되는 일을 전담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8203;</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주2)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u>도사</u></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 ①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사무를 담당한 관직이다. 해당 관서는 다음과 같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충훈부(忠勳府)&#8231;의빈부(儀賓府)&#8231;중추부(中樞府)&#8231;충익부(忠翊府)&#8231;개성부(開城府)&#8231;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두었던 종오품(從五品) 관직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는 1원으로 공신(功臣) 자손 중에서 차출(差出)하고, 대신당상(大臣堂上)이 있으면 자벽(自&#36767;)하였다.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도사</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의 관장 하에 공방(工房)&#8231;노비색(奴婢色)&#8231;녹색(祿色)&#8231;상하색(上下色)&#8231;충익색(忠翊色)의 분장이 있었다.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는 1원으로 그 관장 하에 노비색과 공방의 분장이 있었다.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중추부도사(中樞府都事)</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는 1원,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충익부도사(忠翊府都事)</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는 2원이었으나, 후에 충익부는 충훈부에 병합(倂合)되었다.</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도총부도사</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는 6원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② 의금부(義禁府)의 한 벼슬로서 처음에 종오품이었으나, 후에 종육품(從六品)과 종팔품(從八品) 또는 종구품(從九品)으로 나누어졌다. 종육품 도사는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참상도사(參上都事</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經歷)라 하여 5원 중 1인은 무신(武臣) 중에서 차출(差出)하여 45일 출관(出官)하고 90일에 면신(免新)하였으며, 선생자제(先生子弟)는 10일을 감하였다. 종팔품도사는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참하도사(參下都事)</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로서 5원이며 삼삭(三朔)에 출관(出官)하고, 육삭(六朔)에 면신하였으며, 선생자제는 일삭(一朔)을 감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③ 오부(五部)의 종구품 관직으로 중부(中部)&#8231;동부(東部)&#8231;남부(南部)&#8231;서부(西部)&#8231;북부(北部)에 각 1원씩 있어서 시체(屍體)의 검험(檢驗), 도로(道路)&#8231;교량(橋梁)&#8231;반화(頒火)&#8231;금화(禁火)&#8231;제처(諸處)의 수리(修理)&#8231;청소(淸掃) 등을 맡아보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④ </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u>팔도(八道) 감영(監營)의 종오품 관직으로</u></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u> 감사(監司:觀察使</u></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u>, 從二品)의 다음 관직</u></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이며 정원은 1원이다. 지방관리(地方官吏)의 불법(不法)을 규찰(糾察)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보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8203;</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주3)</span> <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u>필선</u></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사품(正四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세자의 교육을 담당한 기구는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나</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필선</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이라는 관직은 공양왕(恭讓王) 때 서연(書筵) 기구를 정비하면서 처음 만들었다. 이때는 4품관으로 좌&#8231;우 2원을 두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太祖) 즉위 때의 관제에서도</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좌&#8231;우필선(左右弼善</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四品)을 두었으나 1461년(세조 7) 5월에 1원으로 줄여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필선</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으로 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초기에는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사헌부 집의(執義</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三品)나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사간원 사간(司諫</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三品)이, 세종 때는 집현전 관원이 겸임하기도 했으나 경국대전 이후로는 바로 위의 관원인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보덕(輔德</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三品 堂上) 이상만 겸임관이고</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필선</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은 전임관(專任官)으로 만들었다. 1529년(중종 24) 다시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겸필선(兼弼善</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四品) 1원을 증원했다.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겸필선</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은 속대전에 수록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8203;</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주4)</span> <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u>사복지 정</u></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 조선시대 사복시(司僕寺)의 정삼품(正三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제조(提調)</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2원이 있으나 사실상의 사복시의 으뜸 벼슬이었고, 아래로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부정(副正</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三品),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첨정(僉正</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四品),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판관(判官</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五品),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주부(主簿</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六品) 등이 있다.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부정</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은 대전통편에서 폐지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내사복(內司僕)의 내승(內乘)을 겸하여 임금의 가마와 외양간과 목장을 맡아 보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8203;</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주5)</span> <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u>사성</u></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에 둔 종삼품(從三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지사(知事</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二品)가 1원으로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대제학(大提學)</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이 정례대로 겸직하며,</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동지사(同知事</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二品) 2원,</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대사성(大司成</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三品),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좨주(祭酒</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三品) 각 1원이 있고, 아래로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사예(司藝</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四品) 2원,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사업(司業</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四品) 1원,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직강(直講</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五品) 4원,</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전적(典籍</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六品) 13원,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박사(博士</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七品),</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학정(學正</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八品),</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학록(學錄</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九品),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학유(學諭</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九品) 각 3원이 있다.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대사성</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이하 성균관에 소속된 관원을 총칭하여 </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u>관직(館職</u></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이라고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1392년(태조 1)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좨주</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라 하였으나, 1401년(태종 1)에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사성(司成)</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으로 고쳤다. 경국대전에는 정원 2원으로 증원되었으나, 1658년(효종 9)에 1원을 감원하고,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좨주</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1원을 새로 두었다. 문묘(文廟) 외 제례(祭禮)가 있을 때는 이를 주재하기도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8203;</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주6)</span> <span data-ke-size="size16"><u>양현고</u></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 </span><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조선 개국 후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편하면서 성균관의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하여</span><span data-ke-size="size16"> 양현고</span><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를 설치, 운영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1392년(태조 1) 양현고에 2인의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판관</span><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가 태종 때에 판관제도를 폐지하고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사(使)·승(丞)·녹사(錄事)</span><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 각 1인씩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초기에는 성균관에 딸린 2,000여결(結)의 섬학전(贍學田)을 관리하면서 유생 200명의 식량을 조달하였는데, 영조 때 편찬된『속대전』에 따르면 대폭 줄여 학전(學田) 400결로 식량을 공급하였다고 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양현고의 재원은 토지와 노비였는데, 이 재원으로 학생들의 식량·등유 등의 물품조달과 석전제(釋奠祭)의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실제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식량도 제대로 공급하기 힘들어 어물을 별도로 공급해주기도 하고, 기거하는 학생이 많을 때는 자신이 식량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기도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따라서, 성종 때에는 양현고에 토지를 더 지급하여 비용에 충당하게 하였다. 양현고에 속한 노비는 유생의 식사와 기타 관내의 수위·사환 등 잡역을 맡았는데, 때때로 왕이 교육진흥을 위하여 노비를 하사하는 경우가 있어 약 400명에 달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그리하여 일부 노비는 외거하게 하고 일정한 신공(身貢)을 바치게 하였으며, 그 신공으로 등유·돗자리·술·채소 등을 구입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1458년(세조 4)</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대사성</span> <span style="color: #54b800;" data-ke-size="size16">이승소(李承召)</span><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의 상소에 의하면 성균관 학생 200명이 1년간 소비하는 식량이 960석인데 양현고의 수입은 600석으로서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한다. 관원으로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주부(主簿</span><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 종6품) 1인,</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직장(直長</span><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 종7품) 1인,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봉사(奉事</span><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 종8품) 1인을 두었는데, 성균관의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전적·박사·학정</span><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이 각기 겸임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8203;</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주7)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u>보덕</u></span><span style="color: #2d2d2d;" data-ke-size="size16"> : </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관직이다. 처음에 종삼품(從三品)이었으나, 1784년(정조 8)에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승격하였다. 정원은 1원으로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강론(講論)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1392년(태조 1)에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정할 때 좌&#8231;</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우보덕</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각 1명을 두었고 세종 때는 집현전의 관원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1456년(세조 2)에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모두 실직(實職)이 되었으나 경국대전의 편찬과정에서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좌보덕</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은 정식 직제화 되고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우보덕</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은 겸직이 되어 법제에서 빠졌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때로는 홍문관(弘文館)의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직제학(直提學</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三品 堂下)&#8231;</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전한(典翰</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三品)&#8231;</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응교(應敎</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四品)&#8231;</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부응교(副應敎</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四品) 중에서 1명을 선임하여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보덕</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영조 때는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겸보덕(兼輔德)</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등 5명의 겸관직을 시강원에 설치하여 속대전에 법제화하였다. 겸관직의 확대&#8231;증설은 시강원의 비중을 높이고 세자교육을 강화시켜나간 추세와 일치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8203;</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주8)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u>장악원정</u></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의 정삼품(正三品) 당하관이며, 정원은 1원이다. 악공색(樂工色)과 악생색(樂生色)을 관장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위로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제조(提調</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二品∼從一品)가 2원이 있고, 아래로</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첨정(僉正</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四品) 1원,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주부(主簿</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六品) 2원,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직장(直長</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七品)이 있다. 후에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직장</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은 폐지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8203;</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주9)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u>참의</u></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소속된 정삼품(正三品)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당상관(堂上官)</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으로 정원은 각 1원씩 총 6원이다.</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참판(參判</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從二品)의 다음으로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이조참의(吏曹參議)&#8231;호조참의(戶曹參議)&#8231;예조참의(禮曹參議)&#8231;병조참의(兵曹參議)&#8231;형조참의(刑曹參議)&#8231;공조참의(工曹參議)</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가 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1405년(태종 5)에 각 조에</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좌&#8231;우참</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의 2원씩 총 12원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에 무신들을 배려하여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4원을 증치하는 대신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좌&#8231;우참의</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참의</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로 바꾸고, 정원은 1원으로 감원하였다. 각 조의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참판</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과 함께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판서</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를 보좌하면서도</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 판서</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8203;</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주10)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u>참지</u></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 : 조선시대 병조(兵曹)에 딸렸던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품계는 같으나 </span><span style="color: #ff65a8;" data-ke-size="size16">병조참의(兵曹參議</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正三品 堂上)의 다음이다.</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8203;</span><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8203;</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222222;" data-ke-size="size16">&#8203;</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 &#39;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시스템&#39;의 관직 사전 참고</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666666;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묘소] 庭坪정평 向艮坐 남서서</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bpA/6275495164c76e7e932a2a76beff5e7ab9d1eb5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bpA/6275495164c76e7e932a2a76beff5e7ab9d1eb5f" data-origin-width="900" data-origin-height="675"><div class="figcaption">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산 2-1</div></div><p>&#160;</p><p>&#160;</p><p>원본 파일 : 풍천임씨 나의 족보 탐색기 블러그</p><p><a href="https://blog.naver.com/yimcu/223140098977"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blog.naver.com/yimcu/223140098977</a></p>
<!-- -->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죽애공 선조님 이하 직계 선조님별 간단 약력 및 관직 현황 [ 19世祖 ]
yimc
추천 0
조회 22
24.04.10 10:4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