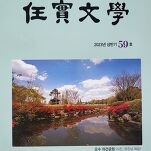<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8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FAMILY: Dotum"></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목에 걸린 피라미가시/오병섭</FONT></SPAN></B></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5%"><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FONT color=#000000>&nbsp;</FONT></o:p></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5%"><?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f" filled="f" path="m@4@5l@4@11@9@11@9@5xe" o:preferrelative="t" o:spt="75" coordsize="21600,21600"><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connecttype="rect" gradientshapeok="t" o:extrusionok="f"></v:path><o:lock aspectratio="t" v:ext="edit"></o:lock></v:shapetype><v:shape id=그림_x0020_1 style="MARGIN-TOP: 6.55pt; Z-INDEX: -2; LEFT: 0px; VISIBILITY: visible; MARGIN-LEFT: 1.5pt; WIDTH: 103.5pt; POSITION: absolute; HEIGHT: 36pt; TEXT-ALIGN: left" alt="C:\Documents and Settings\user\Local Settings\Temporary Internet Files\Content.IE5\8DSC5FJ3\MCj02372490000[1].wmf" wrapcoords="3443 900 1252 1800 -313 8100 -313 15300 1252 19800 1565 19800 21600 19800 21600 3600 5322 900 3443 900" type="#_x0000_t75" o:spid="_x0000_s1026"><FONT color=#000000><v:imagedata blacklevel="13107f" gain="39322f" o:title="MCj02372490000[1]" src="file:///C:\DOCUME~1\ADMINI~1\LOCALS~1\Temp\msohtml1\01\clip_image001.wmz"></v:imagedata><?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w:wrap type="tight"></w:wrap></FONT></v:shape><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아침부터 장대가 줄곧 내렸다<SPAN lang=EN-US>. </SPAN>오늘은 광주 추월<SPAN lang=EN-US>(</SPAN>廣州 草月<SPAN lang=EN-US>)</SPAN>에 있는<SPAN lang=EN-US> S</SPAN>산업의 심사일이다<SPAN lang=EN-US>. </SPAN>여느때나 다름없이 반사적으로 일찍부터 서둘렀다<SPAN lang=EN-US>. </SPAN>답답한 도시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홀가분한 마음<SPAN lang=EN-US>, </SPAN>아니 어린 시절 어머니 손목 잡고 장터 구경가던 그런 설레임 일지도 모른다<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 mso-char-indent-count: 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비는 계속 퍼부어 좁은 계곡마다 하얀 폭포수를 마냥 토해낸다<SPAN lang=EN-US>. </SPAN>모여 흐르는 개울물은 제법 눈에 띄도록 차올라 허리춤은 족히 넘을 것 같다<SPAN lang=EN-US>. </SPAN>지난번 한 차례 왔다간 곳이지만 맑으면 맑은 대로<SPAN lang=EN-US>, </SPAN>비오는 날은 또 그 나름대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다<SPAN lang=EN-US>. </SPAN>새들은 둥지처럼 온화하게 감싸인 이 마을<SPAN lang=EN-US>. </SPAN>오늘따라 개구리 형제들은 종일토록 목청을 높여 합창을 한다<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오후 녘이 되었다<SPAN lang=EN-US>. </SPAN>여름 홍수를 방불케 하는 황톳물이 다리 상판 밑자락까지 닿을락 말락 한다<SPAN lang=EN-US>. </SPAN>여기저기 고기잡이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SPAN lang=EN-US>. </SPAN>차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은 갱구장이처럼 고기몰이 좋아하고 물놀이 즐기던 어린시절 생각에 잠기게 한다<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5%"><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o:p><FONT color=#000000>&nbsp;</FONT></o:p></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삼계<SPAN lang=EN-US>(</SPAN>三溪<SPAN lang=EN-US>), </SPAN>이는 내 고향땅 이름이다<SPAN lang=EN-US>. </SPAN>시냇물 세 줄기가 하나로 모여 제법 큰 강의 원천을 이루는 곳<SPAN lang=EN-US>, </SPAN>섬진강 원류가 되는 곳이다<SPAN lang=EN-US>. </SPAN>발 담그기가 겸연쩍도록 맑은 물에는 은어<SPAN lang=EN-US>, </SPAN>피라미<SPAN lang=EN-US>, </SPAN>붕어<SPAN lang=EN-US>, </SPAN>버들가지<SPAN lang=EN-US>, </SPAN>모래무지<SPAN lang=EN-US>, </SPAN>쏘가리<SPAN lang=EN-US>, </SPAN>매기들이 우리들의 동무가 되었다<SPAN lang=EN-US>. </SPAN>반짝이며 오르내리는 잽싼 피라미들은 빨강<SPAN lang=EN-US>, </SPAN>파랑<SPAN lang=EN-US>, </SPAN>하얀 줄무늬의 색동저고리를 입었기에 더욱 친근한 우리들의 동무였다<SPAN lang=EN-US>. </SPAN>물고기를 잡고 또 잡아도 석양녘 햇빛이 비치는 물결 사이로 뛰노는 그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많아 보였다<SPAN lang=EN-US>. <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그 시절에도 낚시<SPAN lang=EN-US>, </SPAN>어항<SPAN lang=EN-US>, </SPAN>반두<SPAN lang=EN-US>, </SPAN>투망이 있었다<SPAN lang=EN-US>. </SPAN>대로는 은어잡이를 갔다<SPAN lang=EN-US>. </SPAN>서너 명이 동시에 깊은 곳에 있는 은어떼를 얕은 모래밭으로 유인한 후 휘청한 긴 회초리로 내려치면 빠르기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은어도 어김없이 기절을 했다<SPAN lang=EN-US>. </SPAN>은어 몰이의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은어 몰이 후 꽁보리 밥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SPAN lang=EN-US>. </SPAN>그 시냇가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어머님 젖줄같이 언제나 유유히 흐르고 있다<SPAN lang=EN-US>. </SPAN>삶의 늪에 찌들린 찌꺼기를 수정알처럼 씻어 뜨거운 온정을 그곳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난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SPAN lang=EN-US>. </SPAN></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훌쩍 벗어 던지고 고기잡이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SPAN lang=EN-US>.</SPAN></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고……<SPAN lang=EN-US>. </SPAN>곁에 동승한 사장은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고기잡이 좋아하세요<SPAN lang=EN-US>? </SPAN>다음에 한번 오세요<SPAN lang=EN-US>. </SPAN>같이 천렵이나 한번 하시지요<SPAN lang=EN-US>.</SPAN></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 </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하고 권한다<SPAN lang=EN-US>. </SPAN>그 사장도 농촌 출신으로 회사 명칭을 아들 이름 그대로 정할 정도로 다정다감한 분이다<SPAN lang=EN-US>. <o:p></o:p></SPAN></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며칠 후 전화가 왔다<SPAN lang=EN-US>. </SPAN>차편을 보냈으니 무조건 내려 오라는 것이다<SPAN lang=EN-US>. </SPAN>워낙 고기잡이<SPAN lang=EN-US>, </SPAN>물고기 요리를 좋아하니 그리 싫지는 않았다<SPAN lang=EN-US>. </SPAN>도착하니 어둑한 저녁 무렵이었다<SPAN lang=EN-US>. <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큼직한 냄비에 보골보골 끓고 있는 매운탕은 피라미<SPAN lang=EN-US>, </SPAN>쏘가리<SPAN lang=EN-US>, </SPAN>미꾸라지<SPAN lang=EN-US>, </SPAN>모래무지 등 잡탕이었다<SPAN lang=EN-US>. </SPAN>군침 당기는 구수한 냄새며<SPAN lang=EN-US>, </SPAN>물소리<SPAN lang=EN-US>, </SPAN>새소리<SPAN lang=EN-US>, </SPAN>하물며 귓전을 스치는 바람소리까지도 옛날 그 정취다<SPAN lang=EN-US>. </SPAN>둘러앉아 끓기를 기다리며 담소하는 시간은 기나긴 인생 역정 속에서 즐거움만 농축한 행복한 순간인 것 같다<SPAN lang=EN-US>. <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이제 추억을 더듬으며 향취에 젖어 맛을 음미해야 할 순서였다<SPAN lang=EN-US>. </SPAN>그 맛을 음미하는 것도 잠시 뿐<SPAN lang=EN-US>. </SPAN>좋아하는 만큼 허겁지겁 먹다 보니 목에 가시가 걸렸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아무탈 없겠지 하고 쉼 없이 거의 먹어 치웠다<SPAN lang=EN-US>. </SPAN>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법 밤이 깊어졌다<SPAN lang=EN-US>. </SPAN>농촌의 무게 있는 산뜻함과 개구리 울음소리를 멀리하고 서울로 향했다<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목에 걸린 피라미 가시가 불편하다<SPAN lang=EN-US>. </SPAN>수박<SPAN lang=EN-US>, </SPAN>토마토를 먹어보고 상추로 싸서 먹어본들 넘어 가지도 넘어오지도 않는다<SPAN lang=EN-US>. </SPAN>헛구역질을 해보고 물구나무도 서보고 소리를 질러봐도 별 효험이 없다<SPAN lang=EN-US>. </SPAN><?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st1:time w:st="on" o:ls="trans" Minute="0" Hour="0">자정</st1:time>이 넘으니 약국도 문을 닫았다<SPAN lang=EN-US>. </SPAN>아내는 김치에 밥을 싸서 먹으면 넘어갈 수도 있다며 쌀을 씻어 밥을 지었다<SPAN lang=EN-US>. </SPAN>그렇게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이젠 병원에 가는 수밖에 없다<SPAN lang=EN-US>. </SPAN>병원에 이르렀다<SPAN lang=EN-US>. </SPAN>이 늦은 시간에 응급환자도 많다<SPAN lang=EN-US>. </SPAN>겨우 순서가 되어 의사선생님을 만나니 안심이 되었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웬걸<SPAN lang=EN-US>! </SPAN>보이지 않아 뺄 수가 없으니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한다<SPAN lang=EN-US>. </SPAN>그 길로<SPAN lang=EN-US> E</SPAN>대학 부속병원으로 갔다<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양 응석을 떨었다<SPAN lang=EN-US>. </SPAN>엑스레이를 찍고 당직 이비인후과 의사를 깨워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SPAN lang=EN-US>. </SPAN>여기서부터 고생의 씨름이 시작된다<SPAN lang=EN-US>. </SPAN>젊은 여의사는 잠이 덜 깬 듯 엑스레이 필름을 훑어본 다음 아무런 물체도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SPAN lang=EN-US>.<SPAN style="mso-no-proof: yes"> </SPAN><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v:shape id=_x0000_s1027 style="MARGIN-TOP: 6.1pt; Z-INDEX: -1; LEFT: 0px; VISIBILITY: visible; MARGIN-LEFT: 170.25pt; WIDTH: 103.5pt; POSITION: absolute; HEIGHT: 36pt; TEXT-ALIGN: left" alt="C:\Documents and Settings\user\Local Settings\Temporary Internet Files\Content.IE5\8DSC5FJ3\MCj02372490000[1].wmf" wrapcoords="3443 900 1252 1800 -313 8100 -313 15300 1252 19800 1565 19800 21600 19800 21600 3600 5322 900 3443 900" type="#_x0000_t75"><FONT color=#000000><v:imagedata blacklevel="13107f" gain="39322f" o:title="MCj02372490000[1]" src="file:///C:\DOCUME~1\ADMINI~1\LOCALS~1\Temp\msohtml1\01\clip_image001.wmz"></v:imagedata><w:wrap type="tight"></w:wrap></FONT></v:shape><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무얼 드셨다고요<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피라미 매운탕……<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피라미가 뭐에요<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혀가 목구멍을 막으니 도저히 힘이 든 모양이다<SPAN lang=EN-US>. </SPAN>또 마취제를 몇번째 칙칙 뿌린다<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아저씨 나 못 빼겠어요<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의사선생님이 못 빼면 누가 해요<SPAN lang=EN-US>?</SPAN>”하며 의사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아내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비웠고<SPAN lang=EN-US>, </SPAN>그러는 사이<SPAN lang=EN-US> 40</SPAN>여 분의 시간이 흘렀다<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나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SPAN lang=EN-US>. </SPAN>그래도 의사선생님은 기진맥진한 나의 목구멍을 들여다 보며 계속 치료를 한다<SPAN lang=EN-US>. </SPAN>짜증을 부리니 아저씨 같은 엄살은 처음이라고 했다<SPAN lang=EN-US>. </SPAN>목에 걸린 피라미 가시소동은 이렇게 해서 막을 내렸고<SPAN lang=EN-US>, </SPAN>시간은 <st1:time w:st="on" o:ls="trans" Minute="0" Hour="3">새벽<SPAN lang=EN-US> 3</SPAN>시</st1:time>를 가리키고 있었다<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돌아오면서 이번 일을 곰곰히 생각해보았다<SPAN lang=EN-US>. </SPAN>이렇게 별빛이 총총한 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히 잠들어 있을 테지만<SPAN lang=EN-US>, </SPAN>응급실에는 생사의 기로에 선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SPAN lang=EN-US>. </SPAN>고통 받는 어려운 사람들과 이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분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모든 이에게 감사함을 느꼈다<SPAN lang=EN-US>. </SPAN>피라미 가시를 빼준 의사선생님께 감사하고<SPAN lang=EN-US>, </SPAN>내가 괴로울 때마다 곁에 있어 주는 아내에게도<SPAN lang=EN-US>, </SPAN>또한 피라미 가시에게도<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18pt; LINE-HEIGHT: 115%"><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15%; 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굴림"><FONT color=#000000>이번에 갔던 냇가가 내년에도 후년에도 내내 지금처럼 물고기가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맑은 냇가로 오래오래 곁에 있어 주었으면<SPAN lang=EN-US>. </SPAN>그곳이 언제 누가 찾아가도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세며<SPAN lang=EN-US>, </SPAN>하룻밤 쉴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고향이 되지 않을까<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
<!-- -->
카페 게시글
♣회원/문인글터 (수필)♣
목에 걸린 피라미가시/오병섭(삼계 수필원고)
두시
추천 0
조회 46
08.03.30 18:2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