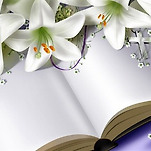<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26">양화진 절두산 탐방</span><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26">&#160;</span><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26">4 -</span><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26">《</span><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26">아리랑의&#160;노래》</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구대열</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mail.google.com%2Fmail%2Fu%2F0%3Fui%3D2%26ik%3Da18b3fa660%26attid%3D0.1.5%26permmsgid%3Dmsg-f%3A1772080174760166485%26th%3D1897b187b2178455%26view%3Dfimg%26fur%3Dip%26sz%3Ds0-l75-ft%26attbid%3DANGjdJ9CfrKCiMnY5ndiUK0vwqiGkrElyYqAIer6I-1LD5lEkoDIjWsCeLFUDG3YAANc8mUU3EimQL_gfAfgDn3JOnoCyrrymFJ7X2bNQbpdp-76j7y2PNEy26GaPHY%26disp%3Dem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mail.google.com/mail/u/0?ui=2&amp;ik=a18b3fa660&amp;attid=0.1.5&amp;permmsgid=msg-f:1772080174760166485&amp;th=1897b187b2178455&amp;view=fimg&amp;fur=ip&amp;sz=s0-l75-ft&amp;attbid=ANGjdJ9CfrKCiMnY5ndiUK0vwqiGkrElyYqAIer6I-1LD5lEkoDIjWsCeLFUDG3YAANc8mUU3EimQL_gfAfgDn3JOnoCyrrymFJ7X2bNQbpdp-76j7y2PNEy26GaPHY&amp;disp=emb" data-origin-width="117" data-origin-height="156"></div><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23">양</span>화진 외국인 묘지를 보고 절두산 교회에 올랐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올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평평한 길이군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러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160;터키-그리스 기행 중 최근에 쓰고 있는 순례와 수도원과도&#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뭔가 통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대학에 입학하면&#160;‘일생의 독서계획’이니&#160;‘평생 읽어야 할 책&#160;100권’&#160;등을 통해 명저들을 소개받지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런데 서양의&#160;&lt;일리아드&gt;, &lt;오디세이&gt;부터 괴테나,&#160;동양의&#160;&lt;논어&gt;, &lt;맹자&gt;, &lt;사기&gt;&#160;등 명저가 아니라&#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우연히 책방에서&#160;‘이게 뭔가?’&#160;하면서 산 책으로부터 감명과 감흥을 받은 책이 있나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나에게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Nym Wales and Kim San의&#160;&lt;Song of Ariran&gt;입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중국 혁명에서 한 한국 공산주의자(A Korean Communist in Chinese Revolution)’이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출판 연도는&#160;1941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160;1972년도 판인 것 같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973년 말이나&#160;1974년 초 런던의 학교 옆 헌책방에서 산 책입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Nym Wales가 김산의 이야기를 쓴 것으로 둘이 공동 저자로 나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Nym Wales는 모택동 전기인&#160;&lt;Red Star over China&gt;를 쓴&#160;Edgar Snow와 결혼했다가 이혼한&#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미국 기자이자 작가입니다.&#160;원명은&#160;Helen Foster이구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Nym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춤,&#160;노래,&#160;문예 등에 뛰어난 숲의 요정 님프(Nymph)이며&#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Wales는 영국 웨일즈 혈통에서 따온 것으로&#160;Edgar Snow가 지어주었다는 것 같은 데&#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워낙 오래전에 읽은 것이라 확인할 수 없군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런데&#160;‘아리랑’이&#160;Arirang이 아니라&#160;Ariran으로 되어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이 책이 발간된&#160;1941년&#160;Nym Wales가 김산으로부터 들을 발음 그대로 옮긴 것이겠죠.</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양자강 이남 강서성 서금(瑞金)의 근거지에 대한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의 소공전(掃共戰)에서&#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모택동이 간신히 벗어나&#160;1만 리 장정을 끝내고 섬서성 연안에 도착한 것이&#160;1935년&#160;10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0만이 출발했으나 도착했을 때는&#160;2만여 명.&#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Helen Foster는&#160;1937년 연안에서 미래의 남편&#160;Edgar를 만났고 공산혁명에 참여한 한국인 김산을&#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보게 되었던 겁니다.&#160;김산의 본명은 장지락(1905-1938)입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연안 근거지가 워낙 어수선하던 때라 경비를 맡은 공산당 공안 담당자인 강생에 의해&#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일본의 스파이’로 몰려 처형되는데&#160;45년이 지난&#160;1983년 중공당이 복원시키지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Nym Wales는 김산과 짧은 만남과 그의 이야기에 끌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아리란의 노래’라는 김산의 전기를 만들었지요.&#160;책 첫 장에 내가 해륙풍(海陸風)이라고 적어 둔 걸 보면&#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김산이 중국 공산주의 운동 초기인&#160;1927-28년 남부 광동성 연안 해풍,&#160;육풍,&#160;줄여서 해륙풍까지 내려가&#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공산 봉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160;책이 나온&#160;1941년이라면 국민당의 계속된 토벌에 맞서면서&#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모택동이 당과 군을 정비하여 소위&#160;‘연안정신’을 창조하며 공산당 제1인자로&#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장기집권을 시작하던 시기입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160;</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mail.google.com%2Fmail%2Fu%2F0%3Fui%3D2%26ik%3Da18b3fa660%26attid%3D0.1.1%26permmsgid%3Dmsg-f%3A1772080174760166485%26th%3D1897b187b2178455%26view%3Dfimg%26fur%3Dip%26sz%3Ds0-l75-ft%26attbid%3DANGjdJ-gFDeTSb_JXc9THYh-yDTmWboE4H52suNf7Pi5ZulMJec524DvHl8j3I6BxaWfr3h595cmR-O42cSfQRJbJzaJnzcdTRsf66m4dguuSzwONPF2g4MArHRjNEU%26disp%3Dem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mail.google.com/mail/u/0?ui=2&amp;ik=a18b3fa660&amp;attid=0.1.1&amp;permmsgid=msg-f:1772080174760166485&amp;th=1897b187b2178455&amp;view=fimg&amp;fur=ip&amp;sz=s0-l75-ft&amp;attbid=ANGjdJ-gFDeTSb_JXc9THYh-yDTmWboE4H52suNf7Pi5ZulMJec524DvHl8j3I6BxaWfr3h595cmR-O42cSfQRJbJzaJnzcdTRsf66m4dguuSzwONPF2g4MArHRjNEU&amp;disp=emb" data-origin-width="397" data-origin-height="591"></div><p style="text-align: start;">&#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span style="color: #000000;"><br></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160;<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16">&#160;&lt;</span><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16">아리랑의 노래</span><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16">&gt;</span><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16">책 표지</span></p><p style="text-align: start;">책에 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칩니다.&#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왜 한 한국 혁명가의 일대기를&#160;‘아리랑의 노래’라고 했을까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김산은&#160;Nym Wales에게 아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래서 책의 서문에&#160;‘아리랑’&#160;가사와 김산의&#160;‘해석’이 나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우리가 잘 아는 부분은 우리말로 씁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아리랑,&#160;아리랑,&#160;아라리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There are twelve hills of Arir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And now I am crossing the last hill</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Many stars in the deep sky-</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Many crimes in the life of m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후렴)&#160;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Ariran is the mountain of sorrow</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And the path to Ariran has no returning</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후렴</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Oh, twelve million countryme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where are you now?</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Alive are only three thousand li</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of mountains and rivers</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후렴</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Now I am an exile crossing the Yalu River</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And the mountains and rivers of three thousand li</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are also lost</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후렴</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고을마다 그들만의 아리랑이 있다고 선배 한 분이 말합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김산의 아리랑도 그중의 하나이겠지요.&#160;잘 알려진 것으로 진도,&#160;밀양,&#160;정선아리랑이 있지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경복궁을 지을 때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일꾼들은 신세타령과 노역의 설움을&#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자신들 마을의 아리랑 가사와 곡조에 맞추어 불렀겠지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몇 년 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선정위원인 임돈희&#160;(동국대교수,&#160;고고인류학과)&#160;동문이&#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이들 아리랑을 취합하여 유네스코에 등록한다고 노력하셨는데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아리랑 고개는 열두 고개/&#160;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고 있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리고&#160;‘아리랑은 설움에 찬 고개/&#160;아리랑 가는 길은 돌아오지 못한다네.’는 최고의 비극성을 보여줍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반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160;‘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160;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난다’나&#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혹은&#160;2절에 나오는&#160;‘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다’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김산의 노래에는&#160;‘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아/&#160;인간들이 이생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가?’라고 되어 있네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김산의&#160;4절&#160;‘아리랑은 설움에 찬 고개/&#160;아리랑 가는 길은 돌아오지 못한다네.’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오늘날 희망의 찬가로 바뀌어&#160;‘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160;이 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로 바뀌었군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아리랑 노래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지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래서 우리는 아리랑의 근본을 잃게 되었구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김산은 조국의 광복과 평등사회를 꿈꾸고 중국으로 망명한 혁명가입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조선 정부에 대한 증오가 그의 글에 가득 차 있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는 아리랑 고개 꼭대기에 거대한 노송이 한 그루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이곳이 수백 년간 정치범을 비롯한 사형수들을 처형한 장소였다지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렇다면 오늘날 이촌동 새남터인가?&#160;절두산은 프랑스 군함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고&#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조선이 병인박해로 대응하던 때 사형장이 되었으니 그 뒤 이야기일 것이구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수백 년 동안&#160;‘수만’&#160;명의 죄수들이 이 나무에 매달려 처형되고&#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 시신은 옆에 있는 절벽에 매달아 두었다고 합니다.&#160;한 젊은이가 감방에 있을 때 이 노래를 지어&#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열두 고개를 넘어 처형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불렀다고 하네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김산에게 있어 아리랑은 죽음의 노래였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러나 그는 아리랑이 죽음의 노래라는 걸 거부하지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우리는 비극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를 비극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D.H.Lawrence의 절규같이 들립니다.&#160;김산은 아리랑이 말하는 죽음은 패배가 아니며&#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수많은 죽음에서 승리가 태어난다고 강조합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이 부분은 비극은 카타르시스를 통해 정신을 승화시킨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160;&lt;시학&gt;과 통하는군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이천만 동포여’와&#160;‘압록강을 건넌다.’라는 마지막 두 구절은&#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910년 이후에 추가된 것이라고 하면서 만주나 중국 본토&#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리고 일본에도 수많은 다른 가사의 아리랑이 있다고 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내가 이 책에 감명받은 것은 김산이 중국인으로 귀화하여 공산혁명에 참여하고&#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장정에도 나섰다는 그의 혁명 이력에 끌려서가 아닙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와 비슷한 이력을 가진 한국인들은 많고 또 거의 잊혔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십 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라느니&#160;‘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라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러&#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너무나 익숙했던&#160;‘아리랑’에&#160;‘아,&#160;우리가 모르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라는 새로운 사연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물론 부패한 조선과 망국의 치욕에 대한 김산의 울분에도 공감했지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러나 그가 불러준 아리랑은 해일 같이 나를 덮쳐버렸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사육신이나 홍경래 농민군,&#160;동학군의 전봉준 등 수많은 농민 반란군,&#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리고 순교자들이 떠올랐습니다.&#160;물론 사형장소는 달랐겠지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신유박해(1801)을 비롯하여,&#160;기해(1839),&#160;병오(1846),&#160;병인(1866)&#160;등 굵직한 기독교 박해만&#160;4번 있었죠.&#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서울로 들어오는&#160;4&#160;대문 앞에 십자가를 던져두고 이것을 밟고 지나면 비기독교인이고,&#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피해 가면 기독교인으로 처형되었다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이 모든 것이&#160;‘아리랑의 노래’와 연상되었다면 나만의 착각일까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절두산 성지 성당으로 오르기 전 널찍한 광장이 있고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멀리서 방문객을 맞더군요.&#160;김대건은&#160;1821년생으로&#160;1845년에 잡혀 다음 해 병오박해 때&#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새남터에서&#160;25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순교합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의 유해를 복원한 두상은 강골인 선비의 기상이 보입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160;</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mail.google.com%2Fmail%2Fu%2F0%3Fui%3D2%26ik%3Da18b3fa660%26attid%3D0.1.2%26permmsgid%3Dmsg-f%3A1772080174760166485%26th%3D1897b187b2178455%26view%3Dfimg%26fur%3Dip%26sz%3Ds0-l75-ft%26attbid%3DANGjdJ-XOy4_k3yUrXa060w5RJvHkQ6X3dia8v60vFlrk0-nhWfyGPy4YhuYdq862nTeVFvnry2AUOClDzeKVs1zUCbjUdCZne-qInNyW0zHm1KLZeTI3Y5sNyM0uYE%26disp%3Dem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mail.google.com/mail/u/0?ui=2&amp;ik=a18b3fa660&amp;attid=0.1.2&amp;permmsgid=msg-f:1772080174760166485&amp;th=1897b187b2178455&amp;view=fimg&amp;fur=ip&amp;sz=s0-l75-ft&amp;attbid=ANGjdJ-XOy4_k3yUrXa060w5RJvHkQ6X3dia8v60vFlrk0-nhWfyGPy4YhuYdq862nTeVFvnry2AUOClDzeKVs1zUCbjUdCZne-qInNyW0zHm1KLZeTI3Y5sNyM0uYE&amp;disp=emb" data-origin-width="336" data-origin-height="560"></div><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160;<br></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160;</span><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16">절두산 광장 성당&#160;</span><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16">김대건 신부 동상</span>&#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성당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 있는&#160;‘순교자를 위한 기념상’도 인상적이군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위에는 순교한 분의 머리 셋이 따로 떨어져 있고 아래에는 손이 밧줄에 묶여있네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머리카락이 잡혀 당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160;세 얼굴이 모두 멍하니 허공을 올려보며&#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처연합니다.&#160;천국을 기원하는 것인가요?&#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머리와 몸이 분리된 순교의 현실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mail.google.com%2Fmail%2Fu%2F0%3Fui%3D2%26ik%3Da18b3fa660%26attid%3D0.1.3%26permmsgid%3Dmsg-f%3A1772080174760166485%26th%3D1897b187b2178455%26view%3Dfimg%26fur%3Dip%26sz%3Ds0-l75-ft%26attbid%3DANGjdJ8wwXWPz3fxZGbFKIx-J_1NvuN02V6VpppQvWiCcwklEofjt3xiHKpNM0swq09sRTgIEpFgouHmYPgq_wparEBaUoUxCmRezHhjq0Ob_ROjlcvRNEKrIoWTl9U%26disp%3Dem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mail.google.com/mail/u/0?ui=2&amp;ik=a18b3fa660&amp;attid=0.1.3&amp;permmsgid=msg-f:1772080174760166485&amp;th=1897b187b2178455&amp;view=fimg&amp;fur=ip&amp;sz=s0-l75-ft&amp;attbid=ANGjdJ8wwXWPz3fxZGbFKIx-J_1NvuN02V6VpppQvWiCcwklEofjt3xiHKpNM0swq09sRTgIEpFgouHmYPgq_wparEBaUoUxCmRezHhjq0Ob_ROjlcvRNEKrIoWTl9U&amp;disp=emb" data-origin-width="326" data-origin-height="551"></div><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br>&#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span>&#160;&#160;<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16">성당으로 오르는 길 입구 순교자를 위한 기념상</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성당 앞 광장에는 상투를 풀어 십자가 윗부분에 못으로 박은 밧줄에 매달고&#16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손은 십자가에 묶인 정하상((丁夏祥)&#160;바오르의 조각상이 있습니다.&#160;</span>(그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160;</p><p style="text-align: start;">정하상의 아버지 정약종(丁若鍾)은&#160;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분이며&#160;</p><p style="text-align: start;">정약용의 형이니 정하상은 그의 조카가 되군요.&#160;</p><p style="text-align: start;">위 조각상은 가혹한 고문을 당한 뒤 서소문 밖 형장에서 처형되기 직전의 모습이라 합니다.&#160;</p><p style="text-align: start;">그런데 조각상이 너무 단아하고 아름답군요.&#160;안내원이 처형 상황을 설명하는 데&#160;</p><p style="text-align: start;">그 처참한 상황을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네요.&#160;정하상과 아버지는 배교하면,&#160;즉 기독교를 버리면,&#160;</p><p style="text-align: start;">살려줄 뿐만 아니라 벼슬을 주겠다는 회유도 거절했다고 합니다.&#160;</p><p style="text-align: start;">세속인인 나로서는 이들의 순교나 혁명에 뛰어든 김산이 일면&#160;</p><p style="text-align: start;">‘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의 소리에 이끌렸겠지만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벗어나려는&#160;</p><p style="text-align: start;">우리의 민속신앙 미륵 사상이 내면에서 꿈틀거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2023.7.22.)</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mail.google.com%2Fmail%2Fu%2F0%3Fui%3D2%26ik%3Da18b3fa660%26attid%3D0.1.4%26permmsgid%3Dmsg-f%3A1772080174760166485%26th%3D1897b187b2178455%26view%3Dfimg%26fur%3Dip%26sz%3Ds0-l75-ft%26attbid%3DANGjdJ_de4YLrL9hH2AJ9rcnKt0EnTyYiXUnRJbCRayAlNqksqJJYUj9iZT2HNKYpO3lSdWneo3xBH4weP4LHJXm6XqplgFf3fcwBvUZwbMYBJMPPL80RF40Q-QbB1s%26disp%3Dem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mail.google.com/mail/u/0?ui=2&amp;ik=a18b3fa660&amp;attid=0.1.4&amp;permmsgid=msg-f:1772080174760166485&amp;th=1897b187b2178455&amp;view=fimg&amp;fur=ip&amp;sz=s0-l75-ft&amp;attbid=ANGjdJ_de4YLrL9hH2AJ9rcnKt0EnTyYiXUnRJbCRayAlNqksqJJYUj9iZT2HNKYpO3lSdWneo3xBH4weP4LHJXm6XqplgFf3fcwBvUZwbMYBJMPPL80RF40Q-QbB1s&amp;disp=emb" data-origin-width="340" data-origin-height="497"></div><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br>&#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16">성당 앞 정약용의 조카 정하상 바오르 상</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color: #007bd9;" data-ke-size="size16">&#160;</span></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20"><b>&lt;이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국제정치학 박사(런던정치경제大/LSE)/한국일보 사회~외신부 기자(견습22기)역임/</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20"><b>近著: &quot;Korea 1905~1945&quot;(From Japanese Colonialism To Liberation And Independence), </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20"><b>&quot;삼국통일의 정치학&quot;, &quot;제국주의와 언론&quot;/부산고~서울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고성 産&gt;</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
<!-- -->
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양화진 절두산 탐방 4 -《아리랑의 노래》 <구대열>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