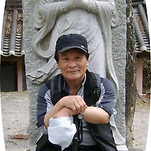<!--StartFragment--><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柳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율목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栗木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긴담모퉁이</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유동은 구한말 인천부 다소면 송림리에 속해있던 동네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각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牛角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 불리다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14</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행정구역 개편 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각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柳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나누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광복 뒤에 일본식 행정구역 이름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바꾸어 유동이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유동은 원래 버드나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버들 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많았기 때문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버드나무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버들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으로 불리다가 이것이 한자로 바뀌어 유동이 됐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이곳에 실제로 버드나무가 많았는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柳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버들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버들고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땅 이름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들은 대부분 버드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실제로는 버드나무 때문이 아니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버드러진 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뜻에서 생긴 이름이 많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버드러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말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바깥쪽으로 벌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뜻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앞으로 튀어나온 이빨을 말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뻐드렁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같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땅 이름에서는 버드러진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버드러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으로 불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이 말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버드러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말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버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잘못 생각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화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楊花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이름이 생기곤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리고 이렇게 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柳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같은 이름이 생기고 나면 흔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전 이곳에 버드나무가 많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柳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집안사람들이 많이 살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등의 이야기가 생기곤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땅의 이름의 원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곳 유동도 실제로 버드나무가 많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면에서 유동은 바로 옆 동네인 율목동이 다소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따져 해석할 필요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율목동 쪽에서 볼 때 유동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앞에 벌어져 있는 동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와 다르게 이곳 유동을 일본인들의 화류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花柳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유동에서 멀지 않은 선화동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식 사창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私娼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유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遊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있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화개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花開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식으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화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花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화류계 여인들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비유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이들은 이곳 유동에도 유곽을 운영한 바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1933</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일본인들이 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천부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보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柳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탈곡공장이 있는 자리에 조선인 유곽을 만들기 위해 온돌이 있는 건물을 만들었으나 잘 되지 않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기록이 나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역시 화류계 여인들을 말하는 단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류장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路柳墻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연상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붙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柳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柳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해석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애키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율목동</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유동과 붙어 있는 율목동은 우리말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밤나무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발음이 조금 바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밤니무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렸던 곳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 한자 그대로 옮겨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율목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栗木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율목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栗木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불리다가 광복 뒤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46</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그대로 율목동이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율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해서는 흔히 이곳에 밤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됐다고 설명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실제로 밤나무가 많았는지는 별다른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런데 이곳이 아니어도 우리나라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밤나무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이 말이 줄어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밤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많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를 한자로 바꾼 이름 중 하나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율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栗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선시대의 유명한 성 리학자 율곡 이이 선생도 고향의 동네 이름을 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쓴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마도 율곡 선생의 동네 역시 당시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율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밤나무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밤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우리말로 더 많이 불렸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런 이름을 가진 동네는 거의 모두가 밤나무가 많았던 곳이라고 설명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중에는 실제로 그런 곳들도 있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그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데 막연히 그렇게 설명하는 곳이 더 많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경우는 우리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반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밭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발음이 바뀐 이름의 동네일 가능성이 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먼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반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벌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뜻의 우리 옛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발아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그 발아진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네를 앞이나 뒤 또는 위쪽에서 볼 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모양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넓게 퍼져서 활짝 열려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발아진 동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줄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반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리다가 그 발음이 다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밤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바뀐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반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밭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바깥 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줄어든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어떤 중심이 되는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바깥에 있는 마을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바깥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발음이 바뀌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밭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됐다가 다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밤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곳 율목동의 경우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밤나무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렸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밤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리지는 않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실제 지형으로 볼 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반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발음이 바뀐 것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특히 율목동은 부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로 유명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바깥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보는 것은 더욱 맞지 않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실제로 밤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밤나무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율목동이 됐다고 봐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럼에도 동네의 옛날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여전히 단정 하기가 어렵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trong>긴담모퉁이</strong></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경동 싸리재에서 답동성당과 기독병원 사잇길을 지나 율목동에서 신흥동으로 넘어가는 길 끄트며리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긴담모퉁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곳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말 그대로 돌담이 길게 놓여있어 생긴 이름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제는 싸리재와 마찬가지로 점차 잊혀가는 이름이 기도 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긴담모퉁이는 일본인들이 이곳에 새로 큰 길을 낼 때 쌓은 축대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예전의 이곳은 지금의 신흥동과 경동 사이에 야트막하게 솟아있는 언덕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nbsp; 지금 송도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신포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흥동과의 경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境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역 일대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0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도 초반까지도 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人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거의 없는 대신 일본인들의 묘지와 절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곳에 묻혀있던 일본인들의 상당수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때 목숨을 잃은 일본군이었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 뒤 이곳의 묘지들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02</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쯤 인근 율목동에 새로 만들어진 공동묘지로 옮겨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대신 신흥동에서 이곳 긴담모퉁이를 지나 축현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의 동인천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이어지는 도로공사가 추진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는 신흥동 일대에 모여 살던 일본인들이 축현역과 그 주변 한국인촌까지 편하게 오가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언덕에 꼬불꼬불한 흙길만 하나 있었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에 일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언덕을 잘라 헤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쪽으로 긴 축대를 쌓아올려 그 사이에 새 도로를 만든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성연 선생이 쓴 향토사 책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開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양관역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洋館歷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따르면 이 공사를 시작한 것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07</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이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에 끝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당시 돈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00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렇게 해서 긴 돌담 축대가 생기게 됐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모퉁이까지 가면 신흥동길과 만나니 이곳에 긴담모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당시 이 공사를 주도한 사람은 산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山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의 일본군 육군 소장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러일전쟁 당시 병참부의 사령관을 맡고 있었던 인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가 러일전쟁이 끝난 뒤에도 공병대를 이끌고 지금의 중구 전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錢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있었던 전환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典園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사에 주둔하면서 이 공사를 맡아서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는 이곳의 공사뿐 아니라 월미도에 벚꽃을 많이 심기도 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당시 일본인들은 이 같은 그의 활동을 칭송한다는 뜻에서 전동의 이름을 산근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山根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바꿔 붙이기도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긴담모퉁이의 돌담 축대에는 가운데쯤에 큰 철문이 하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지금은 아예 폐쇄된 이 철문은 이전에도 늘 닫혀있다시피 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슨 용도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6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8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안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25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쟁 때 죽은 사람들의 시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屍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있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 철문은 일제 강점기 후반에 일본인들이 만든 방공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防空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출입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3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들어 군국주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아시아 전체의 패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覇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꿈꾸던 일본인들이 전쟁에 대비해 만든 방공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201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인천시립박물관이 이곳을 조사한 일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당시 조사를 위해 이 안에 직접 들어가 본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긴담모퉁이에서 시작해 중간에 길이 꺾이면서 신흥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방공호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쟁이 났을 때 일본인들이 대피하기 위한 시설로 만들어졌던 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25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쟁 뒤에는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오랫동안 이곳을 임시 거처로 사용했다고도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말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br></p>
<!-- -->
카페 게시글
미추홀
[중구펴] 유동
천심
추천 0
조회 21
20.08.10 18:3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