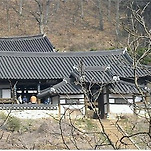<p>&#160;</p><p><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삼국사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신라본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유리이사금 </span><span data-ke-size="size18">9</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32)&gt;</span><span data-ke-size="size18">에는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봄에 육부 이름을 고치고 각각 성을 주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양산부는 양부로 고치고 성을 이씨로 했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고허부는 사량부로 고치고 성을 최씨로 했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대수부는 점량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모부 라고도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로 고치고 성을 손씨로 했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간진부는 본피부로 고치고 성을 정씨로 했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가리부는 한비부로 고치고 성을 배씨로 했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명활부는 습비부로 고치고 성을 설씨로 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영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FHD/bf9a5138c5f19e40fbcbb20d512f628f8d13ef8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FHD/bf9a5138c5f19e40fbcbb20d512f628f8d13ef8a" data-origin-width="509" data-origin-height="763"></div><p><span data-ke-size="size18">이 기록은 한국성의 시작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왔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를 근거로 이른바 최씨대동경주기원설이 나왔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또</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삼국사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신라본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혁거세거서간</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18">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진한 사람들은 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바가지 만드는 풀 열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박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나온 큰 알이 마치 박처럼 생겼으므로 성을 박이라 했다</span><span data-ke-size="size18">.”[1] </span><span data-ke-size="size18">또 같은 책 </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탈해이사금</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18">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궤짝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까치 한 마리가 울면서 따라왔으므로 까치 작자를 줄여 석을 성으로 삼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2] &lt;</span><span data-ke-size="size18">탈해이사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9</span><span data-ke-size="size18">년 봄 </span><span data-ke-size="size18">3</span><span data-ke-size="size18">월</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18">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금빛 궤짝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이라 했다</span><span data-ke-size="size18">.[3]”</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런 기록들은 묘사가 매우 실감 나지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해방 후 삼국통일 이전에 세운 신라 비석이 많이 발견되면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 비석들은 모두 육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六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사성</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賜姓</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했다는 </span><span data-ke-size="size18">32</span><span data-ke-size="size18">년으로부터 </span><span data-ke-size="size18">500</span><span data-ke-size="size18">년 이상 지나서 세운 것들이지만 어떤 비석에도 신라인의 성씨는 적혀 있지 않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따라서 유리이사금 </span><span data-ke-size="size18">9</span><span data-ke-size="size18">년에 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설령 있었다고 해도 계속 유지되지 못했으니 한 번의 해프닝</span><span data-ke-size="size18">(happening)</span><span data-ke-size="size18">에 불과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대표적 사례로서 </span><span data-ke-size="size18">561</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진흥왕 </span><span data-ke-size="size18">11) </span><span data-ke-size="size18">세운 국보 제</span><span data-ke-size="size18">33</span><span data-ke-size="size18">호 창녕비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훼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양부</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거칠부 일척간님과 사훼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사량부</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심표부 급척간님과 촌주 마질 술간님</span><span data-ke-size="size18">”[4]</span><span data-ke-size="size18">라고 적혀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만약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삼국사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적힌 대로 </span><span data-ke-size="size18">32</span><span data-ke-size="size18">년부터 성을 사용했다면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거칠부 일척간님과 최심표부 급척간님과 촌주 마질 술간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라고 적어야 옳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FHD/bd86f666cd4392ec44e72dccdf29cd44ec616f4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FHD/bd86f666cd4392ec44e72dccdf29cd44ec616f41" data-origin-width="622" data-origin-height="621"></div><p>&#160;</p><p><span data-ke-size="size18">또 국보 제</span><span data-ke-size="size18">242</span><span data-ke-size="size18">호 울진봉평리신라비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8">법흥왕이 재판을 벌여 판정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span><span data-ke-size="size18">“524</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법흥왕 </span><span data-ke-size="size18">11) 1</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15</span><span data-ke-size="size18">일 훼부 모즉지 매금왕</span><span data-ke-size="size18">”[5]</span><span data-ke-size="size18">이라고 적혀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훼부는 양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梁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로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삼국사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이씨로 사성 했다 적혀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모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牟&#21363;</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은 법흥왕 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諱</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智</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는 님처럼 사용되는 존칭 의존명사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매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寐錦</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은 신라 임금이라는 것이 고구려 금석문을 통해 증명되어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만약 </span><span data-ke-size="size18">32</span><span data-ke-size="size18">년에 정말로 양부에 이씨로 사성 했다면 법흥왕은 김씨가 아니라 이씨가 되는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신라 </span><span data-ke-size="size18">6</span><span data-ke-size="size18">부가 각각 </span><span data-ke-size="size18">6</span><span data-ke-size="size18">개 성</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姓</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데에 이의를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하지만 </span><span data-ke-size="size18">32</span><span data-ke-size="size18">년에 그들에게 사성을 했다는 기록은 사실이 아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로부터 먼 훗날</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아마도 삼국통일 이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당나라 유학생들이 중국성을 인용</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引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성을 만들 때 양부 귀족은 이씨를 인용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사량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沙梁部</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귀족은 최씨를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참고로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삼국사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량부 최씨는 </span><span data-ke-size="size18">최이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崔利貞</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헌덕왕 </span><span data-ke-size="size18">17</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825) </span><span data-ke-size="size18">당나라 유학생 대표라고 기록되어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그렇다면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한성화된 성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는 바로 신라 진흥왕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하지만 진흥왕의 성씨 사용법은 현대인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색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말하자면 처음 사용하다 보니 서툴렀던 것 같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북제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北齊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하청 </span><span data-ke-size="size18">4</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565)&gt;</span><span data-ke-size="size18">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월 갑인일에 조서를 내려 신라국왕 김진흥을 지절로 삼아 동이교위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책봉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영인</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라고 적혀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즉 신라 </span><span data-ke-size="size18">24</span><span data-ke-size="size18">대 진흥왕이 중국 남북조시대 북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北齊</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무성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武成帝</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로부터 신라왕으로 책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冊封</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받은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FHD/2032f9ea8c6293fafadc47f20692bebc7929a83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FHD/2032f9ea8c6293fafadc47f20692bebc7929a833" data-origin-width="576" data-origin-height="793"></div><p>&#160;</p><p><span data-ke-size="size18">진흥왕은 휘</span><span data-ke-size="size18">[6]</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삼맥종</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三麥宗</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말하자면 김삼맥종을 책봉해야 하는데 실수로 김진흥을 책봉해버린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흔히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 등은 훙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薨逝</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후에 만든 묘호</span><span data-ke-size="size18">[7]</span><span data-ke-size="size18">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진흥왕은 훙서 이전에 이미 진흥으로 불렸으므로 묘호는 아니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본명</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本名</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은 삼맥종으로 따로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아마 생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生時</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사용하던 일종의 존칭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尊稱號</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같은 것으로 추정된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6~7</span><span data-ke-size="size18">세기 신라 임금 기록에는 이런 사례가 많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모두 성씨를 처음 사용하면서 발생한 시행착오로 생각된다</span><span data-ke-size="size18">. 26</span><span data-ke-size="size18">대 진평왕은 휘가 백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白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인데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수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隋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김진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金眞平</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적혀 있고</span><span data-ke-size="size18">, 27</span><span data-ke-size="size18">대 선덕여왕은 휘가 덕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德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인데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책부원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冊府元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김선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金善德</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라 적혀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상을 통해 신라성은 중국과 외교</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外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외교 목적에서 왕이 처음 김씨 성을 사용했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외교적으로 역할이 필요한 귀족들이 또한 김씨를 인용했으니 김유신</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金庾信</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 대표적 사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김유신의 조부 김무력</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金武力</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나 아버지 김서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金舒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은 김유신이 김씨를 인용하므로 인해 저절로 김씨가 되었을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비슷한 사례로 고려 태조 왕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王建</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은 처음에 성이 없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고려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고려세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高麗世系</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의하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왕건의 </span><span data-ke-size="size18">아버지는 용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龍建</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고 할아버지는 작제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作帝建</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인데 훗날 왕건이 왕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王氏</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로 성씨를 만들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모두 왕씨가 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아들이 왕씨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왕씨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 각주 ------------------</p><p>[1] 辰人謂瓠爲朴以初大卵如瓠故以朴爲姓.</p><p>[2] 初&#27357;來時有一鵲飛鳴而隨之宜省鵲字以昔爲氏.</p><p>[3] 以其出於金&#27357;姓金氏.</p><p>[4] 喙居七夫智一尺干沙喙心表夫智及尺干村主麻叱智述干.</p><p>[5] 甲辰年正月十五日喙部牟&#21363;智寐錦王.</p><p>[6] 諱. 죽은 사람 이름. 대개 높여서 부를 때 사용한다.</p><p>[7] 廟號. 훙서(薨逝)한 임금의 시호(諡號). 사당(祠堂)에 모시므로 묘호라 한다.</p><p>&#160;</p>
<!-- -->
카페 게시글
전주최씨 상고사
1. 성씨와 본관 그리고 최씨. (1) 성씨에 관하여. ④ 한국성의 시작.
여수
추천 1
조회 121
25.01.13 02:4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