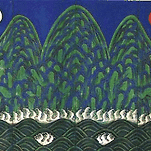<P>참조문:</P>
<P><A href="http://club.golfsky.com/myclub/myclub_fread.asp?board_name=%C0%DA%C0%AF%B0%D4%BD%C3%C6%C7&amp;cafecode=1330&amp;code=1&amp;num=4766590">http://club.golfsky.com/myclub/myclub_fread.asp?board_name=%C0%DA%C0%AF%B0%D4%BD%C3%C6%C7&amp;cafecode=1330&amp;code=1&amp;num=4766590</A></P>
<P>&nbsp;</P>
<P>-------------------------------------------------------------------------------------------------------------------</P>
<P>
<TABLE id=ptr_conten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class=myclub_read_top1 height=35>
<TD class=11_bold vAlign=center align=middle colSpan=3 height=35>이징의 연사모종도 </TD></TR>
<TR class=myclub_read_top2 height=20>
<TD class="">글쓴이 : <SPAN><A href="xxxxjavascript:getuserinfo('bkk072887','2')"><U><FONT color=#0000ff>섬</FONT></U></A></SPAN> </TD>
<TD class="">등록일 : <SPAN>2010-10-29 06:27</SPAN> </TD>
<TD class="">조회수 : <SPAN>300</SPAN></TD></TR><FONT id=prt_content>
<TR>
<TD class=board_content style="BORDER-RIGHT: #d8d8d8 3px solid; PADDING-RIGHT: 35px; PADDING-LEFT: 35px; PADDING-BOTTOM: 30px; BORDER-LEFT: #d8d8d8 3px solid; PADDING-TOP: 10px" colSpan=3>
<TABLE style="TABLE-LAYOUT: fixe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1 border=0>
<TBODY>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BR>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666699; LINE-HEIGHT: 20.8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이징(李澄)의 연사모종도(煙寺暮鍾圖)</SPAN> </P>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666699; LINE-HEIGHT: 20.8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BR></SPAN></P>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666699; LINE-HEIGHT: 20.8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조선 중기의 화가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자함(子涵), 호는 허주(虛舟)로서, 16세기의 대표적인 문인 화가 이경윤(李慶胤)의 서자(庶子)이다. 도화서의 화원이었으며, 수행 화원으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궁중의 행사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1645년에 중국인 화가 맹영광이 소현세자를 따라 조선에 왔다가 3년간 머무르고 돌아간 적이 있는데, 머무르는 동안 그와 가깝게 지내기도 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산수와 인물, 영모(翎毛), 초충(草蟲) 등을 모두 잘 그려 당시에 가장 기량이 뛰어난 화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능숙하게 잘 그리기는 하되 독창적이지 못하고 옛사람들의 법을 흉내 내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보수성은 그가 화원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그는 수묵산수화 뿐 만 아니라 금물로 그리는 이금산수화(泥金山水畵), 그리고 서정성이 물씬 풍기는 동물화도 많이 그렸다. 대표작으로는〈연사모종도(煙寺暮鍾圖)〉와〈이금산수도(泥金山水圖)〉,〈노안도(蘆雁圖)〉등이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663DC4A4E61EAD918"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457" hspace="1" width="457" vspace="1" border="0" id="A_1663DC4A4E61EAD9189FC8"/></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nbsp;</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연사모종도(煙寺暮鍾圖)</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중국 소강(瀟江)과 상강(湘江)의 여덟 가지 풍경을 담은 〈소상팔경도〉라는 소재의 하나이다. 해질녘 연기 피어오르는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까지 화면에 담고자 한 시적인 제목이다. 석장(錫杖)을 짚고 다리를 건너는 스님을 소재로 하였지만 배경의 산수에서 그의 특색이 잘 드러나 보인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구도는 전경과 중경과 원경이 차례로 물러나면서 각 경물 사이는 연운(煙雲)으로 처리해 공간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전통적인 화풍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중경의 옆으로 삐죽 나온 산이나 봉우리들의 모습에서 당시에 유행하던 화풍을 따르고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nbsp;</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IMG class=tx-daum-image id=A_1559ED204BDA607502153F style="CLEAR: none; FLOAT: none; CURSOR: pointer"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1559ED204BDA607502" width=408 vspace=1 border=0 actualwidth="408" isset="true" id="A_1559ED204BDA607502153F"/></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이금산수도(泥金山水圖)1</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nbsp;</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IMG class=tx-daum-image id=A_17522E1F4BDA609D92BA67 style="CLEAR: none; FLOAT: none; CURSOR: pointer" height=772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17522E1F4BDA609D92" width=548 vspace=1 border=0 actualwidth="562" isset="true" id="A_17522E1F4BDA609D92BA67"/></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이금산수도(泥金山水圖)2</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검은 비단에 금물을 풀어 그림을 그린 것으로, 대단히 귀한 그림 중의 하나이다. 이런 귀한 재료를 써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궁중 화가로서의 이징의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또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듯 펼쳐진 산봉우리의 모양이 조선 전기에 유행하던 안견의 화풍을 띠고 있다. 이는 이징이 활동하던 시대에 다른 화가들은 주로 절파화풍의 산수화를 그렸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nbsp;</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IMG class=tx-daum-image id=A_116DBF214BDA60B55D2E6D style="CLEAR: none; FLOAT: none; CURSOR: pointer"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116DBF214BDA60B55D" width=484 vspace=1 border=0 actualwidth="484" isset="true" id="A_116DBF214BDA60B55D2E6D"/></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평사낙안도(平沙落雁圖)</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666699; LINE-HEIGHT: 17.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중국 호북성(湖北省)의 동정호(洞庭湖)로 유입되는 소강(瀟江)과 상강(湘江) 부근의 사계절 풍경을 담은 &lt;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gt;라는 소재의 하나로, 기러기 떼가 강가에 내려앉는 늦가을 풍경이다. 근경에는 누각이 있고 이곳에서 멀리 기러기 떼를 바라보는 인물이 있다. 구도는 전경과 중경과 원경이 차례로 물러나면서 각 경물 사이는 연운(煙雲)으로 처리해 공간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근경의 이러한 구도는 전통적인 안견파 화풍을 보여주는 것이며, 근경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해조묘법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전경의 바위나 중경의 산에서 보여주는 흑백의 대조가 심한 산이나 봉우리들의 모습에서 당시에 유행하던 절파화풍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징의 그림은 이처럼 큰 폭의 산수화에서 더 복고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A href="http://xxxxjavascript:AutoResize(/blog/upload/lation/20070801151650.jpg)"></A></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666699;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P><BR><BR>
<P><A href="http://blog.golfsky.com/myblog/index.asp?blogid=1002924&amp;blogurl=bkk072887"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gt;&gt;&gt; blog.golfsky.com/bkk072887</FONT></U></A></P>
<P>&nbsp;</P></TD></TR></TBODY></TABLE><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4D854A4E61EADA35" class="txc-image" width="243" height="127" style="CLEAR: both; FLOAT: right; MARGIN-LEFT: 8px; WIDTH: 243px; HEIGHT: 127px" actualwidth="400" hspace="1" vspace="1" border="0" id="A_124D854A4E61EADA359198"/></TD></TR></FONT></TBODY></TABLE></P>
<!-- -->
카페 게시글
대조선의 자연
이징(李澄)의 연사모종도(煙寺暮鍾圖)
러브 선
추천 0
조회 674
11.09.03 17:5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