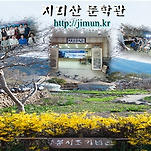<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Section"><a h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strong><font color="#0000ff"><u>문화</u></font></strong></a><a h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67"><u><font color="#0000ff">성범중의한시</font></u></a></td><td style="padding: 0px 20px;"><div class="View_Title"><strong><!--CM_TITLE--><!-- s : 기사 제목 -->長待鳳皇終&#63847;至(장대봉황종부지):오래 기다려도 봉황은 끝내 오지 않는다<!-- e : 기사 제목 --><!--/CM_TITLE--></strong><span>성범중의, 한시를 통한 세상 엿보기 (118)</span></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margin-bottom: 10px; border-right-color: rgb(208, 208, 208); border-bottom-color: rgb(208, 208, 208); border-left-color: rgb(208, 208, 208);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gcolor="#efefef"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40" style="padding: 5px 0px;"><table style="margin-left: 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 <td><img src="/image2006/default/btn_golist.gif" width="55" height="12"></td> //--> <td><a title="폰트키우기" href="xxxxxxxxxxxxxxjavascript:fontPlus();"><img alt="폰트키우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image2006%2Fdefault%2Fbtn_textbig.gif" border="0"></a></td><td><a title="폰트줄이기" href="xxxxxxxxxxxxxxjavascript:fontMinus();"><img alt="폰트줄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image2006%2Fdefault%2Fbtn_textsmall.gif" border="0"></a></td><td style="padding-left: 5px;"><a title="프린트하기" href="xxxxxxxxxxxxxxjavascript:articlePrint('394101');"><img alt="프린트하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image2006%2Fdefault%2Fbtn_print.gif" border="0"></a></td><td><a title="메일보내기" href="xxxxxxxxxxxxxxjavascript:articleMail('394101');"><img alt="메일보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image2006%2Fdefault%2Fbtn_send.gif" border="0"></a></td><td><a title="신고하기" href="xxxxxxxxxxxxxxjavascript:articleErr('394101');"><img alt="신고하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image2006%2Fdefault%2Fbtn_ermail.gif" border="0"></a></td></tr></tbody></table></td><td><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2.12.28&nbsp;&nbsp;</div></td><td align="right"><table style="margin-right: 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a title="트위터" href="http://twitter.com/home?status=%E9%95%B7%E5%BE%85%E9%B3%B3%E7%9A%87%E7%B5%82%EF%A5%A7%E8%87%B3%28%EC%9E%A5%EB%8C%80%EB%B4%89%ED%99%A9%EC%A2%85%EB%B6%80%EC%A7%80%29%3A%EC%98%A4%EB%9E%98+%EA%B8%B0%EB%8B%A4%EB%A0%A4%EB%8F%84+%EB%B4%89%ED%99%A9%EC%9D%80+%EB%81%9D%EB%82%B4+%EC%98%A4%EC%A7%80+%EC%95%8A%EB%8A%94%EB%8B%A4+http%3A%2F%2Fwww.ks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394101" target="_blank"><img alt="트위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image2006%2Fdefault%2FTwitter.gif" border="0"></a></td><td style="padding-left: 3px;"><a title="페이스북"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ks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394101&amp;t=%E9%95%B7%E5%BE%85%E9%B3%B3%E7%9A%87%E7%B5%82%EF%A5%A7%E8%87%B3%28%EC%9E%A5%EB%8C%80%EB%B4%89%ED%99%A9%EC%A2%85%EB%B6%80%EC%A7%80%29%3A%EC%98%A4%EB%9E%98+%EA%B8%B0%EB%8B%A4%EB%A0%A4%EB%8F%84+%EB%B4%89%ED%99%A9%EC%9D%80+%EB%81%9D%EB%82%B4+%EC%98%A4%EC%A7%80+%EC%95%8A%EB%8A%94%EB%8B%A4" target="_blank"><img alt="페이스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image2006%2Fdefault%2Ffacebook.gif" border="0"></a></td><td style="padding-left: 3px;"><a title="미투데이" href="http://me2day.net/posts/new?new_post[body]=%22%E9%95%B7%E5%BE%85%E9%B3%B3%E7%9A%87%E7%B5%82%EF%A5%A7%E8%87%B3%28%EC%9E%A5%EB%8C%80%EB%B4%89%ED%99%A9%EC%A2%85%EB%B6%80%EC%A7%80%29%3A%EC%98%A4%EB%9E%98+%EA%B8%B0%EB%8B%A4%EB%A0%A4%EB%8F%84+%EB%B4%89%ED%99%A9%EC%9D%80+%EB%81%9D%EB%82%B4+%EC%98%A4%EC%A7%80+%EC%95%8A%EB%8A%94%EB%8B%A4%22%3Ahttp%3A%2F%2Fwww.ks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394101&amp;new_post[tags]=%EA%B2%BD%EC%83%81%EC%9D%BC%EB%B3%B4" target="_blank"><img alt="미투데이"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image2006%2Fdefault%2Fme2day.gif" border="0"></a></td><td style="padding-left: 3px;"><a title="요즘" href="http://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101#"><img alt="요즘"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image2006%2Fdefault%2Fyozm.gif" border="0"></a></td><td style="padding-left: 3px;"><a title="네이버" href="http://bookmark.naver.com/post?ns=1&amp;title=%E9%95%B7%E5%BE%85%E9%B3%B3%E7%9A%87%E7%B5%82%EF%A5%A7%E8%87%B3%28%EC%9E%A5%EB%8C%80%EB%B4%89%ED%99%A9%EC%A2%85%EB%B6%80%EC%A7%80%29%3A%EC%98%A4%EB%9E%98+%EA%B8%B0%EB%8B%A4%EB%A0%A4%EB%8F%84+%EB%B4%89%ED%99%A9%EC%9D%80+%EB%81%9D%EB%82%B4+%EC%98%A4%EC%A7%80+%EC%95%8A%EB%8A%94%EB%8B%A4&amp;url=http%3A%2F%2Fwww.ks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394101" target="_blank"><img alt="네이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image2006%2Fdefault%2Fnaver.gif" border="0"></a></td><td style="padding-left: 3px;"><a title="구글" href="http://www.google.com/bookmarks/mark?op=add&amp;title=%E9%95%B7%E5%BE%85%E9%B3%B3%E7%9A%87%E7%B5%82%EF%A5%A7%E8%87%B3%28%EC%9E%A5%EB%8C%80%EB%B4%89%ED%99%A9%EC%A2%85%EB%B6%80%EC%A7%80%29%3A%EC%98%A4%EB%9E%98+%EA%B8%B0%EB%8B%A4%EB%A0%A4%EB%8F%84+%EB%B4%89%ED%99%A9%EC%9D%80+%EB%81%9D%EB%82%B4+%EC%98%A4%EC%A7%80+%EC%95%8A%EB%8A%94%EB%8B%A4&amp;bkmk=http%3A%2F%2Fwww.ks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394101" target="_blank"><img alt="구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image2006%2Fdefault%2Fgoogle.gif" border="0"></a></td><td style="padding-left: 3px;"><a title="msn" href="http://profile.live.com/badge?url=http%3A%2F%2Fwww.ks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394101&amp;text=%E9%95%B7%E5%BE%85%E9%B3%B3%E7%9A%87%E7%B5%82%EF%A5%A7%E8%87%B3%28%EC%9E%A5%EB%8C%80%EB%B4%89%ED%99%A9%EC%A2%85%EB%B6%80%EC%A7%80%29%3A%EC%98%A4%EB%9E%98+%EA%B8%B0%EB%8B%A4%EB%A0%A4%EB%8F%84+%EB%B4%89%ED%99%A9%EC%9D%80+%EB%81%9D%EB%82%B4+%EC%98%A4%EC%A7%80+%EC%95%8A%EB%8A%94%EB%8B%A4" target="_blank"><img alt="msn"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image2006%2Fdefault%2Fmsn.gif" border="0"></a></td></tr></tbody></table></td></tr></tbody></table><table width="690"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align="center" bgcolor="#ffffff"><table width="51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 --> <!-- <xscript src='http://compass.adop.cc/assets/js/adop/adop.js?v=13' ></xscript><ins class='adsbyadop' _adop_zon = '14acc3d1-4afa-43c1-bc4d-b1bb0e6f3492' _adop_type = 'js' style='display:inline-block;width:500px;height:90px;' _page_url=''></ins> --> <!--경상일보_중앙상단_500x90 160905--><p><br></p><p>&nbsp;&nbsp;</p><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Section"><a h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strong><font color="#0000ff"><u>문화</u></font></strong></a><a h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67"><u><font color="#0000ff">성범중의한시</font></u></a></td><td style="padding: 0px 20px;"><div class="View_Title"><strong><!--CM_TITLE--><!-- s : 기사 제목 -->長待鳳皇終&#63847;至(장대봉황종부지):오래 기다려도 봉황은 끝내 오지 않는다<!-- e : 기사 제목 --><!--/CM_TITLE--></strong><span>성범중의, 한시를 통한 세상 엿보기 (118)&nbsp;&nbsp;&nbsp; <span>승인</span> 2012.12.28&nbsp;&nbsp;</span></div></td></tr></tbody></table><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p></td></tr></tbody></table><div id="JSSAP_CmAdView"></div><table width="6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 s : 기사 본문 --><div> </div><div><table width="140" align="lef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nbsp;</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silbo.co.kr%2Fnews%2Fphoto%2F201212%2F394101_136618_1341.jpg" border="1"></td><td width="10">&nbsp;</td></tr><tr><td height="10" colspan="3">&nbsp;</td></tr><tr><td width="10">&nbsp;</td><td></td><td width="10">&nbsp;</td></tr><tr><td height="10" colspan="3">&nbsp;</td></tr></tbody></table></div><div> 1970년대에 데뷔한 김도향의 노래 중에 ‘벽오동 심은 뜻은’이라는 게 있다.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잤더니, 어이타 봉황은 꿈이었다 안 오시뇨. 달맞이 가잔 뜻은 님을 모셔 가잠인데, 어이타 우리 님은 가고 아니 오시느뇨. 하늘아 무너져라 하하하하 와뜨뜨뜨뜨뜨뜨뜨뜨, 잔별아 쏟아져라 와뜨뜨뜨뜨뜨뜨뜨뜨” <br><br>암울한 시대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상황</font> 속에서 聖天子(성천자)로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대변</font>되는 鳳凰(봉황)의 출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고 있다. 봉황의 전반신은 기린, 후반신은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사슴</font>, 목은 뱀,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꼬리</font>는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물고기</font>, 등은 거북, 턱은 제비, 부리는 닭의 모습이며, 깃털은 오색이고 소리는 오음에 맞는다고 한다. 또 봉황은 벽오동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가지</font>에 둥지를 틀고 竹實(죽실)을 먹으며 영천(&#63923;泉)의 물을 마신다고 한다. 김도향의 노래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가사</font>는 다음 시조를 변용한 것이다. <br><br><br><br></div><div><br></div><div><br></div><div>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렸더니<br><br>내 심는 탓이런가 기다려도 아니 오고<br><br>밤중만 일편명월이 빈 가지에 걸렸어라 (작자 미상)<br><br><br><br>이 시조는 봉항이 깃들인다는 벽오동을 심어 놓고 봉황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내가 심은 까닭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봉황은 오지 않고 밤중에 한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조각</font>의 밝은 달만이 빈 가지에 걸려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적 자아의 자기 卑下感(비하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br><br><br><br>庭畔植此碧梧樹(정반식차벽오수)<br><br>뜰 안에 이 벽오동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나무</font>를 심어 놓고 <br><br>欲見鳳皇&#63789;過遊(욕견봉황내과유)<br><br>봉황이 와서 노는 것을 보려고 하네. <br><br>長待鳳皇終&#63847;至(장대봉황종부지)<br><br>오래 기다려도 봉황은 끝내 오지 않고 <br><br>一片明月掛枝頭(일편명월괘지두)<br><br>한 조각 밝은 달만 가지 끝에 걸려 있네. <br><br><br><br>이 시는 조선 후기의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서예가</font> 馬聖麟(마성린, 1727~1798)의 &lt;短歌解(단가해)&gt;에 실린 漢譯(한역)으로 시조의 내용을 재현하고 있다. 다만 시조 작가의 스스로에 대한 自嘲的(자조적) 語調(어조)는 제거하고 말았다. 성범중 울산대학교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국어</font>국문학부 교수&lt; 저작권자 &copy;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경상</font>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gt; </div><div><br></div><div><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span class="masha_index masha_index3" rel="3"></span>벽오동 심은 뜻은</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class=" short_linebreak"><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font-size: 12pt;"><span class="masha_index masha_index4" rel="4"></span>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렸더니</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font-size: 12pt;"><span class="masha_index masha_index5" rel="5"></span>내 심은 탓인지 봉황은 아니오고</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font-size: 12pt;"><span class="masha_index masha_index6" rel="6"></span>밤중에 일편명월만 빈 가지에 걸렸어라</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class=" short_linebreak"><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 font-size: 12pt;"><span class="masha_index masha_index7" rel="7"></span>-조선후기 화원악보집 등재(작자미상)-</span></p></div></tr></tbody></table></td></tr></tbody></table><p>海鶴遺書(한국사료총서 제3집) &nbsp;&nbsp;&gt;&nbsp;&nbsp; <a>海鶴遺書 卷十一 文錄九 詩 &nbsp;&nbsp;&gt;&nbsp;&nbsp;</a> <a>飜時調二絶 </a> </p><div class="cont_view"><div id="cont_view" style="margin-left: 20px;"><div style="text-align: justify; -ms-word-break: break-all;"><b><p style="font-size: 1.2em;">飜<span class="key_highlight">時調</span>二絶</p></b><p style="font-size: 1.2em;"><span style="font-size: 11pt;">春入田園事更多, 培花種藥若誰何, 山童曉起工枇竹, 一簇門扉結已過。</span></p></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padding-left: 0px; -ms-word-break: break-all;"><span style="font-size: 11pt;"> 一樹梧桐用意栽, 借巢祇待鳳凰來, 紗窓日暮聞烏鵲, 急遣家&#20718;更打回。</span><br></div></div></div><p><br></p>
<!-- -->
카페 게시글
시조문학관
長待鳳皇終不至(장대봉황종부지):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렸더니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