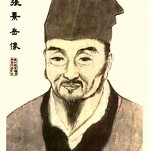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span data-ke-size="size18">[042] </span><span data-ke-size="size18">論曰 百合病者 百脈一宗 悉致其病也 意欲食復不能食 常&#40665;&#40665; 欲臥不能臥 欲行不能行 欲飮食或有美時 或有不欲聞食臭時 如寒無寒 如熱無熱 口苦 小便赤 諸藥不能治 得藥則劇 吐利 如有神靈者 身形如和 其脈微數 每溺時頭痛者 六十日乃愈 苦溺時頭不痛 淅淅然者 四十日愈 若溺快然 但頭眩者 二十日愈 其證或未病而預見 或病四五日而出 或病二十日或一月後見者 各隨證治之</span></p><p>논(論)하며 이르기를: 백합(百合)의 병(病)은 백맥(百脈)의 일종(一宗)이 모두 그 병(病)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니라. 의(意)는 식(食)하려고 하나 다시 식(食)할 수 없고 항상 묵묵(&#40665;&#40665;)하며 와(臥)하려 하나 와(臥)할 수 없으며 행(行)하려 하나 행(行)할 수 없고 음식(飮食)을 먹으려고 하여 간혹 미(美)할 시(時)가 있고 혹 식취(食臭)을 맡으려 조차 안하는 시(時)가 있으며 한(寒)한 듯 하지만 한(寒)이 없고 열(熱)한 듯 하지만 열(熱)이 없으며 구고(口苦)하고 소변(小便)이 적(赤)하며 제약(諸藥)으로도 치료(治)할 수 없어서 약(藥)을 먹으면 극(劇)하게 되고 구토(吐)하고 하리(利)하며 마치 신령(神靈)이 있는 것 같이 하고 신형(身形)은 화(和)한 것 같은데 그 맥(脈)은 미삭(微數)하느니라.</p><p>매번 뇨(溺)할 시(時)에 두통(頭痛)하면 60일(日)이면 낫느니라.</p><p>만약 뇨(溺)할 시(時)에 두(頭)가 통(痛)하지 않고 석석연(淅淅然)하면 40일(日)에 낫느니라.</p><p>만약 뇨(溺)할 시에 쾌연(快然)하고 다만 두현(頭眩)하면 20일(日)에 낫느니라.</p><p>그 증(證)은 혹 미병(未病)에 미리 나타나거나 병(病)을 4~5일(日) 하고 나타나거나 병(病)을 20일(日)이나 1월(月)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거나 하니, 각 증(證)에 따라 치료(治)하여야 하느니라.</p><p><span data-ke-size="size18">[043]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病 發汗後者 百合知母湯主之</span></p><p><span data-ke-size="size18">百合知母湯 方</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七枚 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知母</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三兩 切</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右先以水洗百合 漬一宿 當白沫出 去其水 更以泉水二升 煎取一升 去滓 別以泉水二升煎知母 取一升 去滓 後合和 煎取一升五合 分溫再服</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백합(百合)의 병(病)이 발한(發汗)시킨 후이라면 백합지모탕(百合知母湯)으로 주(主)하여야 하느니라.</p><p style="text-align: center;">◆ 백합지모탕(百合知母湯)의 방(方)</p><p>백합(百合) 7매(枚 벽(擘)) 지모(知母) 3냥(兩 절(切))</p><p>먼저 수(水)로 백합(百合)을 세(洗)하고 일숙(一宿)을 지(漬)하고 흰 거품(:沫)이 나오면 그 수(水)를 거(去)하고 다시 천수(泉水) 2승(升)으로 전(煎)하여 1승(升)을 취하고 재(滓)를 거(去)하느니라. 따로 천수(泉水) 2승(升)으로 지모(知母)를 전(煎)하고 1승(升)을 취하고 재(滓)를 거(去)하느니라. 이들을 합화(合和)하여 전(煎)하고 1승(升) 5합(合)을 취하고 2번에 나누어서 온복(溫服)하느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044]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病下之後者 滑石大&#36205;石湯主之</span></p><p><span data-ke-size="size18">滑石代&#36205;石湯 方</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七枚 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滑石</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三兩 碎 綿&#35065;</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代&#36205;石</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如彈丸大一枚 碎 綿&#35065;</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右先以水洗百合 漬一宿 當白沫出 去其水 更以泉水二升 煎取一升 去滓 別以泉水二升煎滑石 代&#36205; 取一升 去滓 後合和重煎 取一升五合 分溫服</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백합(百合)의 병(病)이 하(下)시킨 후(後)이라면 활석대자석탕(滑石大&#36205;石湯)으로 주(主)하여야 하느니라.</p><p style="text-align: center;">◆ 활석대자석탕(滑石代&#36205;石湯)의 방(方)</p><p>백합(百合) 7매(枚 벽(擘)) 활석(滑席) 3냥(兩 쇄(碎)하고 면(綿)에 과(&#35065;)) 대자석(代&#36205;石) 1매(枚 탄환(彈丸)의 크기를 쇄(碎)하고 면(綿)으로 과(&#35065;))</p><p>먼저 수(水)로 백합(百合)을 세(洗)하고 지(漬)하기를 일숙(一宿)하며 백말(白沫)이 나오면 그 수(水)를 거(去)하고 다시 천수(泉水) 2승(升)으로 전(煎)하여 1승(升)을 취하고 재(滓)을 거(去)하느니라. 따로 천수(泉水) 2승(升)으로 활석(滑石) 대자석(代&#36205;石)을 전(煎)하여 1승(升)을 취하고 재(滓)를 거(去)하느니라. 이들을 합화(合和)하고 거듭 전(煎)하여 1승(升) 5합(合)을 취하고는, 나누어 온복(溫服)하느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045]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病吐之後者 百合&#38622;子湯主之</span></p><p><span data-ke-size="size18">百合&#38622;子湯 方</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七枚 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38622;子黃</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一枚</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右先以水洗百合 漬一宿 當白沫出 去其水 更以泉水二升 煎取一升 去滓 內&#38622;子黃 攪勻 煎五分 溫服</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백합(百合)의 병(病)이 토(吐)시킨 후(後)이라면 백합계자탕(百合&#38622;子湯)으로 주(主)하여야 하느니라.</p><p style="text-align: center;">◆ 백합계자탕(百合&#38622;子湯)의 방(方)</p><p>백합(百合) 7매(枚 벽(擘)) 계자황(&#38622;子黃) 1매(枚)</p><p>먼저 수(水)로 백합(百合)을 세(洗)하고 일숙(一宿)을 지(漬)하며 백말(白沫)이 나오면 그 수(水)를 거(去)하느니라. 다시 천수(泉水) 2승(升)으로 전(煎)하여 1승(升)을 취하고 재(滓)를 거(去)하며 계자황(&#38622;子黃)을 넣고 고루 교(攪)하며 전(煎)하고 5분(分)을 온복(溫服)하느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046]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病不經吐下發汗 病形如初者 百合地黃湯主之 </span></p><p><span data-ke-size="size18">百合地黃湯 方</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七枚 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生地黃汁</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一升</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右以水洗百合 漬一宿 當白沫出 去其水 更以泉水二升 煎取一升 去滓 內地黃汁 煎取一升五合 分溫再服</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中病 勿更服</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大便當如漆</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백합(百合)의 병(病)이 토(吐) 하(下) 발한(發汗)을 거치지 않고 병(病)의 모양이 초기(初)와 같다면 백합지황탕(百合地黃湯)으로 주(主)하여야 하느니라.</p><p style="text-align: center;">◆ 백합지황탕(百合地黃湯)의 방(方)</p><p>백합(百合) 7매(枚 벽(擘)) 생지황즙(生地黃汁) 1승(升)</p><p>이상에서 수(水)로 백합(百合)을 세(洗)하여 일숙(一宿)을 지(漬)하고 백말(白沫)이 나오면 그 수(水)는 거(去)하느니라. 다시 천수(泉水) 2승(升)으로 전(煎)하여 1승(升)을 취하고 재(滓)는 거(去)하느니라. 지황(地黃)의 즙(汁)을 넣고 전(煎)하여 1승(升) 5합(合)을 취하고 2번에 나누어 온복(溫服)하느니라. 중병(中病)하면 다시 복용(服)하지 말지니라. 대변(大便)은 마치 칠(漆)과 같게(: 검다는 말) 되느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047]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病一月不解 變成渴者 百合洗方主之</span></p><p><span data-ke-size="size18">百合洗方</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右以百合一升 以水一斗 漬之一宿 以洗身</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洗已 食煮&#39173; 勿以鹽&#35913;也</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백합(百合)의 병(病)이 1월(月)에도 풀리지 않고 변(變)하여 갈(渴)하다면 백합세방(百合洗方)으로 주(主)하여야 하느니라.</p><p style="text-align: center;">◆ 백합(百合)으로 세(洗)하는 방(方)</p><p>백합(百合) 1승(升)</p><p>물 1두(斗)에 지(漬)하기를 일숙(一宿)하고 신(身)을 세(洗)하느니라. 세(洗)하고는 자(煮)한 병(餠)을 식(食)하니, 염(鹽) 시(&#35913;)로는 하지 말지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048]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病 渴不差者 括蔞牡蠣散主之</span></p><p><span data-ke-size="size18">&#26653;蔞牡蠣散方</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26653;蔞根 牡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熬等分</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右爲細末 &#39154;服方寸匕 日三服</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백합(百合)의 병(病)에 갈(渴)이 낫지 않으면 과루모려산(括蔞牡蠣散)으로 주(主)하여야 하느니라.</p><p style="text-align: center;">◆ 과루모려산(&#26653;蔞牡蠣散)의 방(方)</p><p>과루근(&#26653;蔞根) 모려(牡蠣 오(熬: 볶다) 등분(等分)</p><p>곱게 가루내고 방촌비(方寸匕)를 음(飮)으로 하루에 3번 복용(服)하느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049]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病 變發熱者</span>(一作發寒熱) <span data-ke-size="size18">百合滑石散主之</span></p><p><span data-ke-size="size18">百合滑石散方</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一兩 炙</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滑石</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三兩</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右爲散 &#39154;服方寸匕 日三服</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當微利者 止服 熱則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백합(百合)의 병(病)이 발열(發熱)로 변(變)하면 백합활석산(百合滑石散)으로 주(主)하여야 하느니라.</p><p style="text-align: center;">◆ 백합활석산(百合滑石散)의 방(方)</p><p>백합(百合) 1냥(兩 자(炙)) 활석(滑石) 3냥(兩)</p><p>산(散)으로 만들고 음(飮)으로 방촌비(方寸匕)를 하루 3번 복용(服)하느니라. 약간 리(利)하면 복용(服)을 그치니라. 열(熱)을 제(除)하느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050] </span><span data-ke-size="size18">百合病見於陰者 以陽法救之 見於陽者 以陰法救之 見陽攻陰 復發其汗 此爲逆 見陰攻陽 乃復下之 此亦爲逆</span></p><p>백합(百合)의 병(病)이 음(陰)에서 나타나면 양(陽)의 법(法)으로 구(救)하여야 하고 양(陽)에서 나타나면 음(陰)의 법(法)으로 구(救)하여야 하느니라.</p><p>양(陽)에 나타나면 음(陰)을 공(攻)하여야 하는데 다시 발한(發汗)시키면 이는 역치(逆)이니라.</p><p>음(陰)에 나타나면 양(陽)을 공(攻)하여야 하는데 다시 하(下)시키면 이도 또한 역치(逆)이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051] </span><span data-ke-size="size18">狐惑之爲病 狀如傷寒 &#40665;&#40665;欲眠 目不得閉 臥起不安 蝕於喉爲惑 蝕於陰爲狐 不欲飮食 惡聞食臭 其面目之 乍赤乍黑乍白 蝕於上部則聲喝</span>(一作&#21956;) <span data-ke-size="size18">甘草瀉心湯主之 </span></p><p><span data-ke-size="size18">蝕於下部則咽乾 苦蔘湯洗之 </span></p><p><span data-ke-size="size18">蝕於紅者 雄黃熏之</span></p><p><span data-ke-size="size18">甘草瀉心湯方</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甘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四兩</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黃芩</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三兩</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人參</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三兩</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乾薑</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三兩</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黃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一兩</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大棗</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十二枚</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半夏</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半升</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右七味 水一斗 煮取六升 去滓再煎 取三升 溫服一升 日三服</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苦參湯方</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苦參</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一升</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水一斗 煮取七升 薰洗 日三次</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雄黃薰方</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雄黃</span></p><p><span data-ke-size="size18">右一味爲末 筒瓦二枚合之 燒 向肛熏之</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호혹(狐惑)의 병(病)은 그 모양이 상한(傷寒)과 같고 묵묵(&#40665;&#40665;)하게 면(眠)하려 하고 목(目)은 폐(閉)하지 않고 와기(臥起)가 불안(不安)하며 후(喉)를 식(蝕)하니 혹(惑)이 되고 음(陰)을 식(蝕)하니 호(狐)가 되며, 음식(飮食)을 하려 하지 않고 식취(食臭)를 맡기를 싫어하며 그 면목(面目)은 갑자기 적(赤)하고 갑자기 흑(黑)하며 갑자기 백(白)하느니라.</p><p>상부(上部)를 식(蝕)하면 성갈(聲喝: 소리가 메이다)하니,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으로 이를 주(主)하느니라.</p><p>하부(下部)를 식(蝕)하면 인건(咽乾)하니, 고삼탕(苦蔘湯)으로 세(洗)하여야 하느니라.</p><p>홍(紅: 입술이나 항문 입구)한 곳을 식(蝕)하면 웅황(雄黃)으로 훈(熏)하여야 하느니라.</p><p style="text-align: center;">◆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의 방(方)</p><p>감초(甘草) 4냥(兩) 황금(黃芩) 3냥(兩) 인삼(人蔘) 3냥(兩) 건강(乾綱) 3냥(兩) 황련(黃連) 1냥(兩) 대조(大棗) 12매(枚) 반하(半夏) 반(半) 승(升)</p><p>7가지 약미(味)를 수(水) 1두(斗)에 넣고 자(煮)하여 6승(升)을 취하며 재(滓)는 거(去)하고 다시 전(煎)하여 3승(升)을 취하느니라. 1승(升)을 하루 3번 온복(溫服)하느니라.</p><p style="text-align: center;">◆ 고삼탕(苦蔘湯)의 방(方)</p><p>고삼(苦蔘) 1승(升)</p><p>수(水) 1두(斗)를 자(煮)하여 7승(升)을 취하고 훈(薰)하면서 하루 3차(次) 세(洗)하느니라.</p><p style="text-align: center;">◆ 웅황(雄黃)으로 훈(薰)하는 방(方): 웅황(雄黃)</p><p>이 일미(一味)를 가루내고 통와(筒瓦: 반 원통형 기와) 2매(枚)를 겹친(:合) 것에 넣어서 소(燒)하고는 항(肛)을 향해 훈(熏)하느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052] </span><span data-ke-size="size18">病者脈數 無熱微煩 &#40665;&#40665;但欲臥 汗出初得之三四日 目赤如鳩眼 七八日目四&#30501;黑</span>(一本黃黑) <span data-ke-size="size18">若能食者 膿已成也 赤豆當歸散主之</span></p><p><span data-ke-size="size18">赤豆當歸散方</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赤小豆</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三升 浸 令芽出 曝乾</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當歸</span></p><p><span data-ke-size="size18">右二味 杵爲散 漿水服方寸匕 日三服</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병자(病者)의 맥(脈)은 삭(數)한데 열(熱)은 없으면서 약간 번(煩)하고 묵묵(&#40665;&#40665;)하게 단지 와(臥)하려고만 하고 한출(汗出)을 처음 얻은 지 3~4일(日)에는 목(目)이 적(赤)하여 마치 구안(鳩眼: 비둘기 눈)과 같으며 7~8일(日)에는 목(目)의 네 곳의 자(&#30501;: 눈초리)가 흑(黑)하느니라. 만약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농(膿)이 이미 된 것이니, 적소두당귀산(赤小豆當歸散)으로 주(主)하여야 하느니라.</p><p style="text-align: center;">◆ 적두당귀산(赤豆當歸散)의 방(方)</p><p>적소두(赤小豆) 3승(升. 침(浸)하여 아(芽)가 나오게 하며 폭건(曝乾: 볕에 말림)) 당귀(當歸)</p><p>2가지 약미(味)를 저(杵: 찧다)하여 산(散: 가루)을 내고 장수(漿水: 미음물)로 방촌비(方寸匕)를 복용(服)하느니라. 하루 3번 복용(服)하느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053] </span><span data-ke-size="size18">陽毒之爲病 面赤斑斑如綿紋 咽喉痛 吐膿血 五日可治 七日不可治 升麻鼈甲湯主之 </span></p><p><span data-ke-size="size18">陰毒之爲病 面目靑 身痛如被杖 咽喉痛 五日可治 七日不可治 升麻鼈甲湯去雄黃蜀椒主之</span></p><p><span data-ke-size="size18">升麻鱉甲湯 方</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升麻</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二兩</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當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一兩</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蜀椒</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炒去汗 一兩</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甘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二兩</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雄黃</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半兩 &#30740;</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鱉甲</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手指大一片 炙</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右六味 以水四升 煮取一升 頓服之 老小再服 取汗</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32920;後]][千金方]: 陽毒用升麻湯 無鱉甲 有桂: 陰毒用甘草湯 無雄黃.)</p><p>양독(陽毒)의 병(病)은 면적(面赤)하고 그 반반(斑斑)이 마치 비단무늬(:綿紋)과 같고 인후(咽喉)가 통(痛)하며 농혈(膿血)을 토(吐)하니, 5일(日)이면 치료(治)할 수 있고 7일(日)이면 치료(治)할 수 없느니라. 승마별갑탕(升麻鼈甲湯)으로 주(主)하여야 하느니라.</p><p>음독(陰毒)의 병(病)은 면목(面目)이 청(靑)하고 신통(身痛)하여 마치 장(杖)에 맞는 듯하고 인후(咽喉)가 통(痛)하니, 5일(日)이면 치료(治)할 수 있고 7일(日)이면 치료(治)할 수 없느니라. 승마별갑탕(升麻鼈甲湯)에 웅황(雄黃) 촉초(蜀椒)를 거(去)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하느니라.</p><p style="text-align: center;">◆ 승마별갑탕(升麻鱉甲湯)의 방(方)</p><p>승마(升麻) 2냥(兩) 당귀(當歸) 1냥(兩) 촉초(蜀椒) 1냥(兩. 초(炒)하여 한(汗)을 거(去)) 감초(甘草) 2냥(兩) 웅황(雄黃) 반(半) 냥(兩 연(硏)) 별갑(鱉甲) 1편(片. 수지(手指) 크기. 자(炙))</p><p>6가지 약미(味)를 물 4승(升)에 자(煮)하고 1승(升)을 취하며 돈복(頓服)하느니라. 노인(老)이나 소아(小)는 2번에 나누어 복용(服)하느니라. 한(汗)을 취하느니라.</p>
<!-- -->
카페 게시글
금궤요략
042~053
코코람보
추천 0
조회 19
23.12.30 16:5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