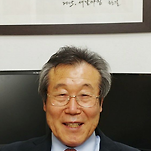<!--StartFragment--><p class="0" style="font-weight: bold;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span></p><p class="0" style="font-weight: bold;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nbsp;&nbsp;<!--[if !supportEmptyParas]-->&nbsp;<!--[endif]-->&nbsp;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말 이름을 '한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 글자 이름을 '한글'이라 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말을 배달겨레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선어라고 하기도 하고 조선 끝 무렵부터 대한제국 때에는 국어라고도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니 우리말을 국어라고 할 수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국어는 일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다고 조선은 사라졌는데 조선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그는 우리말에 새 이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지어 불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우리 글자를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줄여서 정음이라고도 하고 언문이라고도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반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암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갸글이라고도 부르다가 조선 끝 무렵부터 대한제국 때엔 국문이라고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니 우리 글자를 국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라 글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할 수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우리말의 이름을 한말이라고 했듯이 우리 글자를 한글이라고 새 이름을 지어 불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시경은 우리말을 한겨레의 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글을 한겨레의 글이라도 많이 했는데 그 뜻을 담고 하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첫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크다는 뜻도 담은 좋은 이름이었다고 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국어연구학회도 한글모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선어강습원은 한글배곧으로 바꿔불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91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최남선이 만든 어린이 잡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이들보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글풀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란을 만들고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뒤 조선어학회가 한글날도 정하고 한글맞춤법도 만들고 한글이라는 학술지도 내면서 한글이란 말은 뿌리를 내렸으나 한말은 그렇지 못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trong><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토박이말 이름 선구자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trong></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시경은 국어학을 연구하고 문법책을 내면서 그 용어를 토박이말로 적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뒤부터 우리말 이름을 한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글 이름을 한글이라고 하고 주시경이란 제 이름 대신 한힌샘이라고 부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당신의 아들 딸 이름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토박이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바꾸어 큰 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솔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큰아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삼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둘째 아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춘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봄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셋째 아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왕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임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한말글로 바꾸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시경이 이렇게 이름도 토박이말로 바꾸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법용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학술용어들을 토박이말로 지어부르니 중국 한문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그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두루때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부르며 비웃기도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두루때글은 주시경의 한자를 새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읽은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시경의 이름에 쓰인 한자들인 두루 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때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글 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훈독 부분을 차례로 붙이면 두루때글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시경은 토박이말로 이름 짓기 개척자요 선구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span></p><p><br></p>
<!-- -->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아들딸 이름을 토박이말로 바꾼 주시경
나라임자
추천 0
조회 62
18.08.24 05:3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