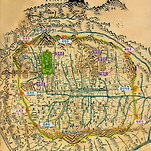<P><STRONG></STRONG></P>
<P class=바탕글><FONT class=Apple-style-span face=바탕><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2px; COLOR: rgb(68,68,68); LINE-HEIGHT: 19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BORDER-COLLAPSE: collaps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2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2px"><STRONG></STRONG></SPAN></FONT></P><FONT class=Apple-style-span face=바탕>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새로 복원한 광화문엘 가 봤다.</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광화문 석축 맨 위에 낮게 담장을 올린 것을&nbsp;여장이라 하는데,</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여장의 장식 중에 사방을 빙 둘러가며 방위를 표시하는&nbsp;8괘 장식을 했는데...</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이 8괘 장식을 보면, 해당 팔괘의 지괘관국에 해당하는 괘가 같이 그려져 있다.</STRONG></SPAN></SPAN></SPAN></P><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Gulim, 굴림">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STRONG></P></SPAN>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TEXT-ALIGN: left;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nbsp;&nbsp; &nbsp;&nbsp;</STRONG></SPAN></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Gulim, 굴림"><IMG class=tx-daum-image id=A_1915C5324CAC206E2515CC style="CLEAR: none; FLOAT: none; CURSOR: pointer; BORDER-TOP-STYLE: none; BORDER-RIGHT-STYLE: none; BORDER-LEFT-STYLE: none; BORDER-BOTTOM-STYLE: none"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1915C5324CAC206E25" width=300 vspace=1 border=0 isset="true" actualwidth="300" id="A_1915C5324CAC206E2515CC"/></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BR></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단순히 8괘만으로서 방위를 표시하고자 했다면&nbsp;</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현재 장식되어있는 대로가 해당 방위에 맞다.</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8괘의&nbsp;후천방위에 맞게 배열을 했으니까 말이다.</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북쪽에는 사진과 같은 감괘<SPAN style="FONT-SIZE: 14pt">(</SPAN></SPAN></SPAN></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27px; LINE-HEIGHT: 42px; 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4pt">&#9781;)</SPAN></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Gulim, 굴림">를, 북서쪽은 건괘<SPAN style="FONT-SIZE: 14pt">(</SPAN></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9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4pt">&#9776;)</SPAN></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Gulim, 굴림">, 동북쪽에는 간괘(</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9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9782;</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Gulim, 굴림">)</SPAN></STRONG></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그리고 광화문 광장쪽에서 본 남쪽 가운데에는 리괘(</SPAN></SPAN></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9px; LINE-HEIGHT: 29px; FONT-FAMILY: 바탕">&#9778;</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Gulim, 굴림">)</SPAN></STRONG></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FONT class=Apple-style-span face="Gulim, 굴림" size=4><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그 왼쪽(서남)은 곤괘(</SPAN></FONT><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9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9783;</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Gulim, 굴림">), 동남은 손괘(</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9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9780;</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Gulim, 굴림">)가 있다.</SPAN></STRONG></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Gulim, 굴림">그리고 담장 쪽으로 동쪽에는 진괘(</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9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9779;</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Gulim, 굴림">)가, 서쪽에는 태괘(</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9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9777;</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Gulim, 굴림">)가 있다.</SPAN></STRONG></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BR><STRONG></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BR><STRONG></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헌데, 문제는 8괘가 아니라&nbsp;64괘의 방위가 표현이 되었다는 점이다.</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해당 방위의 괘를 지괘로 해서 각 방위에 8괘씩 64괘로 표현을 했다는 점이다.</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우리가 64괘를 방위에 맞게 배열하고자 한다면</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사실 후천방위로는 표현을 할 방법이 없다.</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nbsp;</STRONG></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그런데, 광화문 여장에 장식 된 방위표시는 64괘의 방위표시이므로</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현재처럼 단순하게 후천8괘의 방위로 표시해서는 안되고</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복희64괘방위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nbsp;</STRONG></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복희64괘방위는 선천8괘의 방위에 그 8괘에 해당하는 지괘관국으로 표현이 되므로</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현재 북쪽(경복궁쪽 중앙)에 붙어있는 저 감괘는 북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어야 한다.</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BR><STRONG></STRONG></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제대로 했으면 팔괘의 그림이 있어야 할 위치.</STRONG></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BORDER-COLLAPSE: collaps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2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2px"><BR><STRONG><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9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BORDER-COLLAPSE: separat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SPAN style="FONT-SIZE: 18pt"><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55ff>&#9777;</FONT></SPAN><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55ff>(兌)</FONT>&nbsp;&nbsp;</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BORDER-COLLAPSE: separat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SPAN style="FONT-SIZE: 18pt">&#9776;</SPAN>(乾) &nbsp;</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BORDER-COLLAPSE: separat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SPAN style="FONT-SIZE: 18pt"><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55ff>&#9780;</FONT></SPAN><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55ff>(巽)</FONT></SPAN><BR><BR><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102,102,102);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COLOR: rgb(68,68,68); LINE-HEIGHT: 29px; FONT-FAMILY: 바탕; BORDER-COLLAPSE: separat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SPAN style="FONT-SIZE: 18pt">&#9778;</SPAN>(</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COLOR: rgb(68,68,68); LINE-HEIGHT: 29px; FONT-FAMILY: 바탕; BORDER-COLLAPSE: separat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離)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SPAN></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185,185,187); LINE-HEIGHT: 43px; FONT-FAMILY: 바탕"><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LINE-HEIGHT: 42px; BORDER-COLLAPSE: separat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8pt">&#9781;</SPAN></FONT></SPAN><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0000>(坎)</FONT></SPAN><BR><BR><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BORDER-COLLAPSE: separat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SPAN style="FONT-SIZE: 18pt"><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55ff>&#9779;</FONT></SPAN><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55ff>(震)&nbsp;</FONT>&nbsp;</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BORDER-COLLAPSE: separat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SPAN style="FONT-SIZE: 18pt">&#9783;</SPAN>(坤) &nbsp;</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9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BORDER-COLLAPSE: separat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SPAN style="FONT-SIZE: 18pt"><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55ff>&#9782;</FONT></SPAN><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55ff>(艮)</FONT></SPAN><BR></STRONG><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5px"><BR></SPAN></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BORDER-COLLAPSE: collaps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2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2px"><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5px"><STRONG>위가 남쪽, 아래가 북쪽임.</STRONG></SPAN></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BORDER-COLLAPSE: collaps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2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2px"><SPAN style="FONT-SIZE: 11pt"><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바탕; BORDER-COLLAPSE: separat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우리의 국기,&nbsp;</SPAN></SPAN></SPAN>태극기의&nbsp;4괘도 위 선천8괘 중에서 건곤감리(남북</SPAN></SPAN></SPAN></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5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BORDER-COLLAPSE: collaps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2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2px">서</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BORDER-COLLAPSE: collaps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2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2px">동)</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BORDER-COLLAPSE: collapse;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2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2px">&nbsp;4괘만 취한 것임.</SPAN></STRONG></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FONT-FAMILY: Gulim, 굴림"><STRONG>&nbsp;</STRONG></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64괘가 표현이 된 패철만 봤어도 저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BR><STRONG></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그리고 해당 장식안의 64괘 배열도</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후천방위에 입각해서 배열이 되었는데, 바뀌어야 할 것 같다.</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지괘는 감괘로 동일하고, 천괘는 선천8괘방위대로 가야 할 것이다.</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STRONG>패철에 있는 64괘의 순서와 같이 말이다.</STRONG></SPAN></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BR><STRONG></STRONG></SPAN></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STRONG></P>
<P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STRONG></P>
<P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STRONG></P>
<P>
<TABLE style="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BORDER-TOP: rgb(0,0,0) 0.28pt solid; FONT-SIZE: 12px; MARGIN-LEFT: 8.3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COLOR: rgb(51,51,51); LINE-HEIGHT: 1.3;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6;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TD style="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rgb(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FONT-SIZE: 12px;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WIDTH: 32.33pt; COLOR: rgb(102,102,102); LINE-HEIGHT: 1.3;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TEXT-ALIGN: center;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c2c2c2><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0000><STRONG>困</STRONG></FONT></SPAN></FONT></SPAN></P></TD>
<TD style="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rgb(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FONT-SIZE: 12px;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WIDTH: 32.33pt; COLOR: rgb(102,102,102); LINE-HEIGHT: 1.3;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HEIGHT: 29.8pt" vAlign=center>
<P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STRONG></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TEXT-ALIGN: center;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c2c2c2><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0,0,0)"><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0000><STRONG>訟</STRONG></FONT></SPAN></SPAN></FONT></SPAN></P>
<P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STRONG></P></TD>
<TD style="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rgb(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FONT-SIZE: 12px;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WIDTH: 32.33pt; COLOR: rgb(102,102,102); LINE-HEIGHT: 1.3;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HEIGHT: 29.8pt" vAlign=center>
<P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STRONG></P>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TEXT-ALIGN: center;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c2c2c2><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0,0,0)"><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0000><STRONG>渙</STRONG></FONT></SPAN></SPAN></FONT></SPAN></P>
<P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WORD-WRAP: normal"><STRONG></STRONG></P></TD></TR>
<TR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6;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TD style="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rgb(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FONT-SIZE: 12px;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WIDTH: 32.33pt; COLOR: rgb(102,102,102); LINE-HEIGHT: 1.3;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TEXT-ALIGN: center;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c2c2c2><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0,0,0)"><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0000><STRONG>未濟</STRONG></FONT></SPAN></SPAN></FONT></SPAN></P></TD>
<TD style="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rgb(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FONT-SIZE: 12px;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WIDTH: 32.33pt; COLOR: rgb(102,102,102); LINE-HEIGHT: 1.3;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TEXT-ALIGN: center; WORD-WRAP: normal"><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c2c2c2><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0000><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27px; COLOR: rgb(102,102,102); FONT-FAMILY: 바탕"><STRONG>&#9781;</STRONG></SPAN></FONT></SPAN></FONT></P></TD>
<TD style="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rgb(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FONT-SIZE: 12px;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WIDTH: 32.33pt; COLOR: rgb(102,102,102); LINE-HEIGHT: 1.3;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TEXT-ALIGN: center;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c2c2c2><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0,0,0)"><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0000><STRONG>坎</STRONG></FONT></SPAN></SPAN></FONT></SPAN></P></TD></TR>
<TR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6;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TD style="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rgb(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FONT-SIZE: 12px;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WIDTH: 32.33pt; COLOR: rgb(102,102,102); LINE-HEIGHT: 1.3;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TEXT-ALIGN: center;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c2c2c2><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0,0,0)"><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0000><STRONG>解</STRONG></FONT></SPAN></SPAN></FONT></SPAN></P></TD>
<TD style="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rgb(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FONT-SIZE: 12px;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WIDTH: 32.33pt; COLOR: rgb(102,102,102); LINE-HEIGHT: 1.3;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TEXT-ALIGN: center;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c2c2c2><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0,0,0)"><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0000><STRONG>師</STRONG></FONT></SPAN></SPAN></FONT></SPAN></P></TD>
<TD style="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rgb(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FONT-SIZE: 12px;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WIDTH: 32.33pt; COLOR: rgb(102,102,102); LINE-HEIGHT: 1.3;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ORD-BREAK: normal;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TEXT-ALIGN: center; 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c2c2c2><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0,0,0)"><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0000><STRONG>蒙</STRONG></FONT></SPAN></SPAN></FONT></SPAN></P></TD></TR></TBODY></TABLE></P>
<P>&nbsp;</P>
<P>&nbsp;</P>
<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건춘문과 여장</SPAN></STRONG></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TRONG></SPAN>&nbsp;</P>
<DIV class=ViewContents>
<DIV><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경복궁의 동쪽 문. 조선 태조가 처음으로 세운 궁궐인 경복궁에 딸린 문으로, 문 안에 왕세자가 있던 춘궁(春宮)이 있었고 왕의 종친·상궁(尙宮)만 출입하였다. 옛 문은 임진왜란 때 타버렸으며 현재의 문은 1865년(고종 2) 경복궁 중건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2칸이며 홍예문을 낸 석축(石築) 기단 위에 단층으로 세운 이익공식(二翼工式) 우진각 지붕의 건물이다. 처마는 겹처마이고 지붕의 각 마루는 양성(兩城)을 한 뒤 취두(鷲頭)·용두(龍頭)·잡상(雜像) 등을 배열하고, 추녀 끝에 토수(吐首)를 끼웠다. </SPAN><FONT style="FONT-SIZE: 11pt" color=#0055ff>축대 위 건물 둘레에는 여장(女墻)을 둘렀고,</FONT><SPAN style="FONT-SIZE: 11pt"> 홍예문의 천장에는 널판을 대고 그 위에 용을 그려서 궁성의 출입문임을 상징하고 있다. 일본인들에 의해 조선총독부청사가 세워진 뒤로는 광화문 대신 경복궁의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SPAN><BR></STRONG></DIV></DIV>
<DIV class=Valuation><STRONG></STRONG></DIV><!-- 답글영역 -->
<P><STRONG></STRONG>&nbsp;</P>
<P><STRONG>경복궁 서십자각입니다</STRONG>.</XBODY><A href="xxxxxxxxjavascript:albumViewer('viewer','/_c21_/pds_down_hdn?grpid=iwAH&amp;fldid=6Ho4&amp;dataid=39&amp;fileid=1&amp;regdt=20031225205726&amp;realfile=%B0%E6%BA%B9%B1%C3+%BC%AD%BD%CA%C0%DA%B0%A21%B9%F8.jpg&amp;ln=1&amp;grpcode=KoreanLaboratory&amp;dncnt=N&amp;.jpg')"><IMG id=upload_image1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fe984.daum.net%2F_c21_%2Fpds_down_hdn%3Fgrpid%3DiwAH%26fldid%3D6Ho4%26dataid%3D39%26fileid%3D1%26regdt%3D20031225205726%26realfile%3D%25B0%25E6%25BA%25B9%25B1%25C3%2B%25BC%25AD%25BD%25CA%25C0%25DA%25B0%25A21%25B9%25F8.jpg%26ln%3D1%26grpcode%3DKoreanLaboratory%26dncnt%3DN%26.jpg" align=absMiddle vspace=3 border=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controlImage(this.id);"></A></P>
<P>&nbsp;</P>
<P>&nbs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STRONG>동십자각 (東十字閣)</STRONG></SPAN></P><SPAN style="FONT-SIZE: 12pt"><!--StartFragment--></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지정번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3호</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지정연월일: 1972년 8월 30일</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시대: 조선시대, 고종 2년(1865)</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규모ㆍ양식: 정면 3칸 측면 3칸, 익공계 겹처마 사모지붕</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재료: 석조 축대, 목조</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소유자: 국유 </STRONG></SPAN></P><SPAN style="FONT-SIZE: 12pt">
<P class=바탕글><STRONG></STRONG>&nbsp;</P></SPAN><SPAN style="FONT-SIZE: 12pt"><!--StartFragment--></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은 동쪽에는 건춘문(建春門), 서쪽에는 영추문(迎秋門), 남쪽에는 정문인 광화문(光化門), 그리고 북쪽에는 신무문(神武門)이 자리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그 4대문에 수문장과 포졸들이 궁을 경비하게 되어 있었다.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동십자각은 광화문에서 동쪽으로 조성된 경복궁 외궁성(外宮城)이 건춘문(建春門)을 향하여 꺾이는 부분에 세운 망루(望樓)였다. 고종 때 중건된 경복궁에는 원래 궁궐 전면(前面) 담 양쪽 모서리에 궁궐 내외를 감시하는 망루의 기능을 갖고 있던 건물로 동십자각(東十字閣)과 서십자각(西十字閣)이 있었다.</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동십자각과 서십자각은 경복궁 광화문을 중심으로 각각 궁궐의 동남쪽과 서남쪽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었으나, 서십자각은 일제가 조선총독부 청사를 짓고 광화문을 옮기는 시기인 1923년부터 1926년 사이에 철거되었고, 동십자각은 1924년경 길을 넓히기 위해 궁궐 담을 헐어 안으로 옮기면서 현재와 같이 길 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건물이 되었다.</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동십자각의 기단 축대는 조선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누각 건물은 1865년(고종2년) 경복궁 중건 때의 것이다. 건물은 장대석으로 네모 반듯하고 높다랗게 쌓은 축대 위 둘레로 십자형(十字形)으로 뚫린 여장(女墻)을 전벽돌로 둘렀고, 그 안에 사방 3칸 규모로 들어섰다. </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여장 서쪽에는 진입계단을 설치하였고, 화강석으로 상부가 있는 문틀을 세워 두 짝 목조 출입문을 달았다. 이는 동십자각이 망루이기 때문에 그날의 당직이 오르내릴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였고, 당시의 당직들이 이 문을 통해 드나들었던 것이다. 지면에서 누각으로 통하던 석조계단은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고, 축대 위 각 면에는 서수(瑞獸)의 머리장식으로 꾸민 석루조(石漏槽 : 돌 홈통)가 2개씩 있다.</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이 건물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짜임새가 야무지고 광화문 좌우의 누각으로서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서 경복궁의 여러 건물 중에서도 뛰어난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청사가 건립되기 이전의 경복궁 규모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다.</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사진 위 오른쪽 끝 건물이 동십자각이고 뒤쪽으로 경복궁 돌담길이 이어진다.</SPAN></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옛날에는 가운데로 개천이 있었고 기와집과 초가집, 그리고 판자집도 있다.</SPAN></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920년대와 오늘날의 동십자각 모습을 담아 봤습니다.</SPAN></STRONG></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SPAN></STRONG></SPAN><IMG class=txc-image id=A_1307AD464D9EB75123A951 style="CLEAR: none; FLOAT: none"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07AD464D9EB75123" width=640 vspace=1 border=0 actualwidth="640" id="A_1307AD464D9EB75123A951"/></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IMG class=txc-image id=A_151C1B464D9EB7590450F4 style="CLEAR: none; FLOAT: none"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51C1B464D9EB75904" width=550 vspace=1 border=0 actualwidth="550" id="A_151C1B464D9EB7590450F4"/></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IMG class=txc-image id=A_190211464D9EB7602C87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90211464D9EB7602C" width=550 vspace=1 border=0 actualwidth="550" id="A_190211464D9EB7602C8700"/></P>
<P class=바탕글></P>
<P><!-- --><!-- end clix_content --><BR></P></FONT>
<!-- -->
카페 게시글
경복궁
여장의 장식 중에 방위를 표시하는 8괘 장식/동십자각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