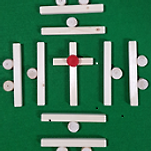<!--StartFragment--><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난을 극복하고 아시리아 동방교회의 당에 선교</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吳昶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창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만 중원대학교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론</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진경교류행중국비에는 아시리아 동방교회가 당에 건넜던 당시의 고난이 기술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시리아의 아라본이라는 덕이 있는 사람이 청운의 꿈을 가지고 비와 바람에도 지지 않고 고난과 위험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정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성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眞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장안에 옮겨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쓰여 진 이 짧은 글로도 아시리아 동방교회의 선교사들이 서 아시아로부터 동쪽으로 건너갔던 고난의 경위를 상상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시리아 동방교회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었던 모펫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moffe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그 분야의 제일인자이고 그의 저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시아의 그리스도교사 상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아시리아동방교회의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연구하는 데에 꼭 참고해야 할 대표작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펫트의 최대의 공헌은 아시리아동방교회의 기원에 대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토마스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앗다이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르메니아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지의 설을 세워 이것에 의한 아시리아동방교회의 역사가 예수의 사도와 같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오늘까지 발전했다고 하는 설의 기초를 쌓았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근대의 학자가 메소포타미아 중앙아시아의 교회의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부터 아시리아동방교회가 널리 알려지게끔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표적인 저작으로서는 토마스 이테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homas Yeates 1768-186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818</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저술한 인도교회사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은 가장 빠른 시기에 아시리아 동방교회의 아시아에서의 선교에 대하여 설명한 글이라 보여 중국의 대진경교와 아시리아 동방교회가 서로 역사적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기술 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테스의 저작은 모펫트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시아그리스도교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다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7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이상이나 전에 쓰여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본문에서는 대진경교류행중국비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와 바람에도 지지 않고 고난과 위험을 뒤돌아보지 않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어구에서 아시리아동방교회가 중국에 건너간 노정을 고찰하고 그들의 실크로드에 있어서 궤적을 살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0E053658E0337435" class="txc-image" width="54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1486776458534.jpg" exif="{}" actualwidth="540" id="A_220E053658E0337435DE57"/></p><p><br></p><p><!--StartFragment--></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리적인 범위</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시리아동방교회는 대진경교로서의 중국에 들어가는 이전은 주로 중앙아시아를 주된 활동의 범위로 하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후에 아시리아동방교회는 네스토리우스파의 그리스도론을 지지 했기 때문에 서방교회보다 이단으로 간주되고 또 페르시아와 로마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제국의 대립의 영향도 있고 중앙아시아와 그보다 더욱 먼 동방을 그들의 선교활동의 거점으로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로부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波斯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파사는 페르시아 후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大秦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 칭하게 되고 당시에 이미 아시아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일을 알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당시중국과 서양세계의 사이의 교역은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토지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앙아시아는 고대의 중국을 아시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프리카와 결부시키는 중요한 교역로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국 장안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뻗은 이 길은 근대의 학자들에 의하여 실크로드라고 이름 지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크로드의 기원은 고대세계의 중심이었던 문명이 서로 교류를 행하였던 것에서 시작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대의 제국은 머나먼 지역과의 교역을 하기 위하여 이교역로를 형성하여 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국은 동쪽문명의 중심으로서 오랫동안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페르시아의 사산조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2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동서 간에서 세력을 떨쳤던 대국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쪽에는 지중해 세계의 지배자인 로마제국이 군림하여 있고 이들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제국이 각각의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완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거리의 무역활동도 안전하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크로드는 이들의 지역의 주된 대국과 그들에 속하는 소국사이를 맺는 경로이고 이들 교역로의 총칭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크로드에서는 상인과 여행객 뿐 아니라 종교인도 이 길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넓혀나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스도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르아스타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니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힌두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 등은 전부 실크로드를 통하여 각각의 거점을 설치하면서 종교의 세력을 확대시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메르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마르칸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카슈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호탄 등의 지역에서는 다른 종교가 공존하는 현상 마저도 보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것으로 봐서 중국과 외래문화는 쌍방 간의 교류뿐 만아니라 다방면의 교류가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시리아동방교회가 중국으로 건너기 이전은 중국의 조선기술은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진경교류행중국비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운을 타고 비와 바람에도지지 않고 곤란과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성경을 옮겨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하는 글에서도 당시의 교류가 주고 육로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교류는 교역과 포교뿐 아니라 외교와 군사적인 행동으로도 보여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당시의 당왕조는 항로에 의한 교류에 대하여서는 소극적이었지만 명왕조와 같이 쇄국하여 문호를 철폐하는 정책은 취하지 않고 역으로 외부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어서 당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廣州</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市舶司 右威衛中郞將</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周慶立</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奇器異巧</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만들고 황제에 헌상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박사 우위위중랑장의 주경립이 기이하고 이상한 기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감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監選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殿中侍御史</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394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택이 서간을 바쳐서 진언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현종이 주경립을 처형했다고 하는 역사도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마도 이것이 원인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及&#63903;</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급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중국에 남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진경교류행중국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승 수라함과 대덕급열 그리고 서국의 귀족 세속외의 고승들은 교회의 규정을 정비하고 신앙의 계승을 유지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쓰여 있듯이 급열이 재차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로 아시리아동방교회와 조정과의 관계를 수복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개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73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재차 조공하고 현종으로부터 자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紫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가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袈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반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反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5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필을 받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바꾸어 말하자면 아시리아동방교회가 아득히 먼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에 건너간 두 가지의 루트는 육상의 실크로드와 항로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초기는 주로 육로를 통하고 후에 항로를 빈번히 이용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br></p>
<!-- -->
카페 게시글
세계역사 이야기
아시리아 동방교회의 당나라에 선교 1
청암
추천 0
조회 112
17.04.02 08:1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