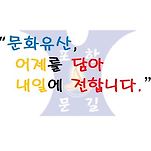<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5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42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20pt; FONT-WEIGHT: bold">내연산&nbsp;한시&nbsp;산책</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아름다운 내연산</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밤이 와서 서늘한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 파뿌리 같은 허연 수염을 한 스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합장을 하는데, 말을 하려고 하자 입에서 연기가 났다. 나에게 말하였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나는 서역에서 왔는데 이 산 속에 거울을 묻고서 곧 이 산의 주인이 되어, 이 산에 찾아온 많은 시인과 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신선경의 이 산을 함부로 잘못 평하였습니다. 천추의 내연산을 주왕산과 비교하는 것도 수치인데, 하물며 저 청량산 따위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또한 이 산을 매번 청량산의 아래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산이 당신들 두 시인 묵객을 만나서 한 마디로 저들의 망령된 평을 깨어버리시는군요.”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내가 이에 천천히 대답하였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그대의 말씀인즉 옳습니다. 주왕산은 내연산과 비교하여 산수가 대략 비슷하여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서로 장단점은 있으니, 산이 있는 곳이 드러나고 숨은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량산은 이렇게 평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이 있는 곳이 인현(仁賢)한 마을에 가까운데, 곧 퇴계 선생이 이 산에 깃들어 숨어 살며 스스로 ‘청량산인(淸凉山人)’이라고 한 뒤로 산 이름이 더욱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무 봉우리, 아무 암자가 빼어나다는 점은 명산의 둘째가는 조건일 뿐입니다. 주왕과 내연, 이 두 산에는 일찍이 선현의 발자취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내연산에 이름을 써 놓은 사람들을 보자니 모두가 서울에서 왔더군요. 연달아 찾아오는 벼슬아치들 때문에 산의 그윽하고 조용한 맛이 다 깨어지고, 참선하는 스님들이 아득히 떠나 가버렸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그리고서 나도 또한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노애집(蘆厓集) 권1 &lt;동유기행(東遊紀行)&gt;</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1 내연산 원경&gt;</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51813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65363D52E263B11C"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165363D52E263B11C347B"/></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문인으로 안동 사람인 노애(蘆厓) 유도원(柳道源, 1721-1791)이 친구 단사(丹砂) 김성필(金聖弼)과 1773년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주왕산과 내연산 등지를 여행하고 쓴 장편 기행시의 한 대목이다. 그는 내연산을 유산(遊山)하고 보경사에서 청하현감 엄구(嚴球)와 만나 이야기하다가 잠자리에 들었고, 이런 꿈을 꾸었던 것이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규장각 학사요 문장가였던 청성(靑城) 성대중(成大中, 1832-1712)은 흥해군수로 부임하여 1783년에 경상관찰사 이병모(李秉模, 1742-1806)와 내연산을 유산하고 암자의 선방(禪房)에서 묵어갔다. 밤에 별빛과 달빛이 산에 가득하였고, 새벽에 비가 조금 뿌렸다고 하였다. 민가 열 몇 집이 계곡 가에 있고, 개 짖는 소리, 닭 울음 들리는 은폭 주변이 무릉도원과 같다며 가을날에 그곳으로 꼭 한 번 가고 싶어 하였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2 내연산 은폭&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20500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2B804052E263CB2B"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12B804052E263CB2B36F5"/></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그는 내연산은 봉우리가 기이하지는 않지만, 물과 돌이 아름답고, 밝고 빼어난 기운이 있으며, 사람을 고무시키는 힘이 있어서 명산임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지구 생성 46억년의 시간이 빚은 내연산은 예로부터 작은 금강산으로 불릴 만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보경사에서 연산폭포까지는 물론이고, 은폭에서 내연산수목원까지의 계곡에도 그윽한 아름다움이 숨어있다. 내연계곡의 최상류에까지 버들치와 물까마귀, 수달이 서식한다. 개구리와 도롱뇽과 현호색과 얼레지, 참나무, 단풍나무 등의 풍부한 동식물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이토록 경관이 수려하여 내연산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아낌을 받아왔다. 불교문명이 꽃피었던 신라&#61598;고려 시대에는 보경사와 암자들을 짓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중생을 구원하는 지혜와 행복의 열쇠를 얻기 위하여 수행자들이 머물고, 세상살이에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신행 도량이 되었다. 유교문명이 국가와 사회의 지도 이념이 되었던 조선 시대에는 사대부들이 유산(遊山)을 하며 치세의 덕성을 함양하였다. 민중들은 산이 베푸는 은덕에 감사하며 산을 숭배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문명의 역사가 1,500년을 헤아리는 내연산에 어떤 인문학적 내용과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시대에는 포항 사람들조차 잘 모른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내연산의 여러 이름</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낙동정맥의 울진 백암산은 영천 보현산으로 이어지고, 보현산에서 동쪽으로 온 산줄기가 바닷가 청하에서 솟아 응봉(鷹峰)이 되었다. 응봉에서 다시 동쪽으로 내연산과 신구산(神龜山, 천령산), 두 줄기 산이 굽이치며 그 사이에 내연계곡 50리를 열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부석사, 화엄사와 같이 보경사도 화엄종 사찰이다. &lt;&lt;화엄경&gt;&gt;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모신 적광전이 금당인 보경사가 창건되면서 내연산 이름을 종남산이라 하였다. 의상대사가 당나라로 유학하여 화엄종 2조 지엄 스님 문하에서 화엄학을 공부하던 지상사가 있고, 신라의 유학승들이 머물며 공부하던 중국 불교의 명산이 종남산(終南山)이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3 중국 시안 종남산&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22544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30674352E263E630"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730674352E263E630DF27"/></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후백제의 견훤이 금성을 침공하자 신라의 국왕과 신하들이 내연산으로 피란 온 뒤로 종남산을 내영산(內迎山)이라 하였다. ‘영오랑과 연오랑’, ‘영일과 연일’의 경우처럼, ‘영(迎)’과 ‘연(延)’의 글자 모양과 소리가 닮아서 조선시대에 내영산을 내연산으로도 불렀고, 대체로 20세기에 들어서는 내연산만 남게 되었다. 내연산의 향로봉(香爐峰)은 류숙의 1624년 시에 나타난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1224년의 &lt;원진국사탑비문&gt;에는 내연산을 신귀산(神龜山)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문헌과 지도에는 내연계곡 남쪽 산줄기를 신구산, 북쪽 산줄기를 내연산이라고 하였지만, 연산폭 서쪽 내연산을 신귀산이라고 표기한 지도도 있다. 내연산은 수려하여 소금강산이라고도 불렀다. 1587년에 내연산 산놀이를 하였던 해월 황여일은 ‘금강산’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배우는 사람에, ‘신귀산’은 내면의 덕성을 기르는 ‘위기(爲己)’의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에 비유하며, 군자가 과연 내연산의 어느 이름을 좋아할 것인지를 물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nbsp;내연산에 꽃 피어난 불교문화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중국 남조 진(陳)나라에 유학 갔던 지명(智明) 법사가 신라로 귀국하여 왜구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사찰로 보경사를 진평왕 때 창건하였다. 지금도 신라시대의 석탑, 석등, 신방석, 주춧돌이 남아 있으며, 현존하는 4개의 암자는 물론이고 6세기 후반의 신라시대 유물까지 출토되는 암자터를 포함하여 10개가 넘는 암자터들이 확인된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4 내연산 보경사&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77945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56CC3D52E2640026"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756CC3D52E26400266725"/></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보경사’의 ‘보경(寶鏡)’은 보름달을 말하고, 달은 부처님의 진리를 비유한다. 보경사 창건 연기 설화에 연못을 메우고 팔면 보경을 묻었다고 하였다. 팔면 보경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팔정도를 상징한다. 원진국사가 만년에 주지로 오래 머물다가 입적한 뒤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 보경사의 적광전 금당에서,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스님을 이어 수선사(修禪社)의 2세 지도법사로 &lt;&lt;선문염송(禪門拈頌)&gt;&gt;을 쓴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 스님이 법문을 하고 읊은 게송에는 ‘보경’이 불성의 비유어로 나온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구월 초이일에 보경사 원진국사 문도의 청으로 상당법문을 하고 스님이 게송하기를</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九月 初二日 寶鏡圓眞國師門徒請上堂 師云</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오늘 아침에 장마 비가 개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今朝宿雨初晴</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탁 트인 허공이 끝이 없구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廓落太虛無際</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누가 말했던가, 보경이 티끌에 묻혔다고&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誰云寶鏡埋塵</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영원한 그 광명이 항상 세상을 비추는데.&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自有常光照世</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진각국사어록(眞覺國師語錄)&gt;&gt;</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보경사에 보물로 지정된 원진국사 승탑과 탑비가 있다. 탑비는 테두리에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연화당초무늬가 새겨져 있어서 고려 불교 문명의 세련되고 국제적인 미감을 잘 보여준다. 승탑은 절 뒤의 산 중턱에 있으며 완형이 잘 남아 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5 보경사 원진국사탑비&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29679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37874152E2641831"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537874152E2641831CBAA"/></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고려시대 원진국사는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제창하고 수선사를 이끈 보조국사에게 불법을 배웠다. 1215년 보경사 주지가 된 스님은 몽골군에 쫓겨 고려에 들어와 청도 운문사를 점거하고 도적 떼가 된 거란족 무리에게 &lt;&lt;육조단경(六祖壇經)&gt;&gt;을 강설하여 교화시키고, 기도를 하여 가뭄에 비가 내리게도 하였다. 춘천 청평산 문수원에서 이자현(李資玄) 거사의 &lt;문수원기&gt;를 읽다가 &lt;&lt;능엄경&gt;&gt;의 중요성을 알고 열람하였다. 1221년 7월에 팔공산 염불사로 옮기고 9월 2일 의자에 앉아 입적하기 전까지 보경사에서 제자들에게 &lt;&lt;능엄경&gt;&gt; 강의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불교사에서 &lt;&lt;능엄경&gt;&gt;을 널리 알린 이는 원진국사인 것이다. 제자들이 다비를 하고 사리를 보경사에 모셨다. 이규보가 표문을 지어 올리고 고종이 원진(圓眞)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국자감 대사성 이공로(李公老)가 비명을 짓고, 보문각 교감 김효인(金孝印)이 글씨를 썼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원진국사가 내연산 들머리의 송라 부근에 있던 광흥사에 머물며 새벽과 저녁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경사 적광전을 참배하였다. 어느 날 밤, 예불을 하고 법당 문을 나오자 마당에 황소만한 큰 범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이 범에게 전생의 빚이 있음을 알고, 몸을 던져 굶주리는 범의 생명을 구하는 보살행을 하였다. 범은 유해를 절 뒤의 명당에 버려 달라는 스님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 자리에 승탑을 세웠다고 하는 미담이 보경사에 전해 내려온다고 회관(誨寬) 스님이 &lt;보경사사적기&gt;에 적고 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가을 풍광을 읊는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諷吟秋光</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천지에는 예와 이제 없건만&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 天地無古今</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인생은 비롯과 마침이 있구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人生有始終</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묵묵히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니&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40665;然觀物理</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시냇물에 떠 내리는 서리 맞은 단풍잎&nbsp;&nbsp;&nbsp;&nbsp;&nbsp;&nbsp;&nbsp; 霜葉下溪楓</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오암집(鰲巖集)&gt;&gt;</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오암 스님의 시이다. 조선시대에 보경사에 머문 스님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오암당(鰲巖堂) 의민(毅(義)旻, 1710-1792) 스님이다. 청하 월포리에서 아버지 김준(金浚)과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모친이 달을 머금는 태몽을 꾸었다. 세종 때 청하로 귀양 온 개성유수 김운(金芸)의 후손으로 효행과 우애로 남해현감에 천거되고 보경사 입구에 학산서원(鶴山書院)을 세운 김석경(金錫慶)이 스님의 조부이다. 나이 스물두 살에 모친을 여의는 슬픔을 당하여 친척 되는 보경사의 각신(覺信) 장로 스님 밑으로 출가하였고, 계영(桂影) 강백의 법을 이어 서산대사의 9세 법손이 되었다. 스님은 삼용추(삼폭포) 위 대비암(大飛庵)에 젊은 시절부터 오래 머물며 후학을 길렀다. 불교계에서는 스님을 영남의 ‘으뜸가는 어른(宗丈) 스님’으로 불렀다. 스님은 &lt;&lt;선문염송&gt;&gt;의 여러 화두에 게송을 덧붙였다. 스님의 아름다운 승탑과 벽옥(碧玉) 탑비가 지금 보경사 서운암(瑞雲庵)에 있다.</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 &lt;사진6 보경사 서운암 오암당 의민 스님 승탑&gt;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74378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64723E52E2642C2A"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364723E52E2642C2A5BBA"/></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자하가 여쭈어 말하였다: “‘어여쁜 웃음 보조개 짓고, 아리따운 눈동자 흑백이 분명하니, 흰 것으로 광채를 내도다!’ 하니, 이것은 무엇을 일컬은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것을 뒤로한다.” 자하가 말하였다: “예가 제일 뒤로 오는 것이겠군요?”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나를 깨우치는 자, 상(商, 자하의 이름)이로다!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子夏問曰: “ ‘巧笑&#20521;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子曰: “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김용옥, &lt;&lt;논어한글역주&gt;&gt;2 &lt;팔일(八佾)&gt; 제3</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7 일본 통신사로 갔을 때의 청성 성대중 33세 모습&gt;</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96626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48A33D52E264412F"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448A33D52E264412F05CF"/></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1787년에 흥해군수 청성 성대중이 77세의 오암 스님의 문집에 쓴 내용을 읽어보자. 청성은 내연산이 바닷가에 서리어 있는데 겉으로 보면 범상하지만 웅장한 기운이 하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미르와 범을 갈무리하고 구름과 비를 지어내기에 족하여 동쪽 영남의 진산(鎭山, 주변을 거느리는 산)이 된다고 하였다. 삼용추(三龍湫, 연산, 관음, 잠룡 세 폭포)의 특출한 경관은 오히려 그 아름다움의 말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산에는 회관, 우홍(宇洪) 같은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한 오암 스님이 머물기에 산이 더욱 더 중후하다고 하였다. 유학을 하는 집안 출신의 스님은 시를 좋아하여 백편의 시들을 손 가는대로 지었는데, 시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님의 시들이 투박하고, 쉽게 지었다고 헐뜯었다. 청성은 스님의 시가 정말로 질박하지만 싣고 있는 기운이 두텁고, 취하고 있는 소재가 넓어서, 소재가 빈곤하고 꾸밈이 많은 시와는 많이 다르며, 쉽게 시를 쓴 것은 그만큼 내면에 축적한 공부에서 시가 유래함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스님의 시를 헐뜯을 게 못된다고 평하였다. 오히려 스님을 보면 사람됨이 ‘넓고(宏), 크고(碩), 법도에 맞고(典), 두터워서(厚)’ 옛날의 후덕한 스님의 풍모인데, 시가 과연 그 사람과 같다고 하였다. 청성은 자신의 벗인 현천(玄川) 원중거(元重擧)로부터 오암 스님과 농수(農&#21471;) 최천익(崔天翼, 1712-1779)은 영남 좌도(嶺南左道, 낙동강 동쪽의 영남 지방)의 위인들이라는 말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흥해군수로 부임해와 오암 스님을 뵙고 보니 과연 듣던 것과 같았다고 하였다. 다만, 농수는 이미 고인이 되어 만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자신이 농수의 묘지명을 짓고, 오암 스님의 문집에 서문을 쓴다고 하였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8 보경사 오암당 의민 스님 진영&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24219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19EA3D52E264550C"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619EA3D52E264550CBC90"/></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청성은 시는 진실로 문장의 한 기교에 지나지 않으나 모든 문체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시를 오직 기교나 꾸미는 것만으로 시평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lt;&lt;논어&gt;&gt;에 ‘회사후소(繪事後素)’라고 한 것처럼, 인품의 바탕이 아름다운 뒤에야 재능을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스님을 이야기할 때, 풍만하고 후덕한 인품을 말하여야지, 한갓 스님의 시만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삼용추가 웅장한 기세를 가진 내연산을 다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내연산을 보면 내연산의 주인인 스님의 인품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스님의 시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라고 물으며, 스님과 농수는 진실로 동쪽 영남 지방의 빼어난 인물들이라고 하였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9 일본 통신사로 갔을 때의 현천 원중거 46세 모습&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88528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1F9D4452E264690F"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31F9D4452E264690F9151"/></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현천 원중거와 농수 최천익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야겠다. 현천은 이덕무(李德懋), 성대중(成大中), 박제가(朴齊家), 유득공(柳得恭), 홍대용(洪大容), 황윤석(黃胤錫), 남공철(南公轍), 윤가기(尹可基) 등과 교유하였다. 그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 세속의 명리와는 타협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기질과 지사적인 삶은 연암그룹(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북학파)의 젊은 지식인들로부터 어른으로 존대 받았다. 그는 또한 시인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였는데, 그의 시는 성당(盛唐)의 넉넉한 시풍과 청신한 시어를 특징으로 하였다. 시인으로서의 그의 명성은 결국 그를 조엄(趙&#26350;)을 정사로 하는 1763년 계미통신사행의 서기로 일본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 때 성대중도 서기로 동행했다. 1770년(영조 46)에 내연산이 있는 청하현의 송라도찰방(松羅道察訪)으로 부임해와 60일 만에 교체되었다. 이 때 오암 스님과 농수 최천익과 교유하였다. 그는 송라도찰방을 그만 둔 뒤에 가난에 쪼들리게 되었고, 결국 선영이 있는 용문산 아래에 은거하였다. 1776년 무렵에 장원서주부(掌苑暑主簿)를 맡게 되었고, &lt;&lt;해동읍지(海東邑誌)&gt;&gt;의 편찬에 연암그룹의 인물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그는 1790년(정조 14)에 죽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농수 최천익 진사는 흥해군의 향리였으며, 여항(閭巷: 사대부 양반이 아닌 평민, 중인 계층)의 시인으로서 서울에까지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오암 스님과 절친한 벗이었다. 천재였던 농수는 당대의 문장가들과 교유할 정도로 학문과 문장이 탁월하였으며, 사암(思庵) 최기대(崔基大), 소수재(蔬水齋) 류인복(柳寅福), 이계(耳溪) 장사경(張思敬), 라천(羅泉) 이학해(李學海) 같은 제자들을 배출하여 바닷가의 궁벽진 고을, 흥해(興海)가 문사(文士)의 고을이 되게 하였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10 농수 최천익 진사의 간찰&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49506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643A3E52E2647C2B"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6643A3E52E2647C2B9ABB"/></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농수가 죽은 지 10년이 못되어 제자가 시집을 간행하고자 하여 흥해군수로 왔던 문장가 청성 성대중에게 산정(刪定)을 요청하였다. 청성이 &lt;촉석루에서-청천 신유한(申維翰)의 시에 차운함(矗石樓 次申靑泉韻)&gt;를 뽑아서 시집에 넣고 싶은데, 그 셋째 구에 나오는 ‘두월(斗月)’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목이 메이고 차가운 강물은 흐르고 싶어하지 않고, 咽咽寒江不肯流</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홀로 남겨진 세 비석만이 빈 고을을 굽어보고 있네. 獨留三碣&#38955;虛洲</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남아는 수양성에서 전사한 장순이 있고, 男兒騈死&#30562;陽堞</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우주에는 촉석루가 높이 솟아 있다. 宇宙仍高矗石樓</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달과 빛을 다툰 것은 당시의 일이요, 斗月光爭當日事</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산하의 기운 일어나 어두운 하늘까지 뻗쳤네. 山河氣作亘雲愁</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낡은 옷깃 가득 눈물 적시며 난간에 기대 오래 있자니, 滿襟衰淚憑欄久</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아름다운 계절에도 즐겨 놀고 싶은 마음 없네. 佳節無心辦勝遊</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농수집(農&#21471;集)&gt;&gt;</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11 흥해읍 용전리 농수 최천익 진사의 묘소&gt;</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16219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055F4152E2649213"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7055F4152E264921343C9"/></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류인복이 꿈에서 스승에게 이 시를 시집에 넣을 지 말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자, 농수는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나도 성에 차지 않아서, 그 구를 ‘매서운 기세로 쇠뇌를 당기니 일월과 빛을 다투고(日月光爭張&#24366;怒)’로 고치고 싶었는데 미처 원고에 쓰지 못했네.”라고 하였다. 청성은 시인이 시를 다듬는 습관은 죽어서도 변하지 않으니, 두보가 소양직(蘇養直)의 꿈에서 자신의 시, &lt;팔진도(八鎭圖)&gt;의 ‘유한실탄오(遺恨失呑吳)’를 잘못 해석하는 것을 고쳐준 일만 그러하겠느냐고 하였다. 또 최기대가 시집을 간행할 때 목판의 두 글자가 일그러져 어떻게 교정할까 걱정하자 역시 스승이 꿈에 나타나 ‘회(灰)’자를 쓰며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일화도 손만익(孫萬翼)이 쓴 농수의 행장에 나온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보경사에는 10세기 경 조성된 미려한 비로자나삼존불상, 18세기의 &lt;비로자나불후불도&gt;, &lt;관음보살괘불도&gt;, &lt;팔상도&gt;를 비롯한 많은 보물들을 간직하고 있다. 1742년에 뇌현(雷現) 등의 화승이 그린 적광전의 &lt;비로자나후불도&gt;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집성한 40권의 조선시대 불화집 중에서 선별하여 간행한 &lt;&lt;한국불화명품선집&gt;&gt;의 표지화가 될 정도로 조선시대 불화를 대표한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12 보경사 적광전 비로자나불삼존상, 비로자나후불도&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76874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693B4252E264A405"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2693B4252E264A405ABF1"/></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지금 보경사 대웅전 뒤에 놓여있는 커다란 통나무 구유는 밥통도, 물통도 아니다. 제지도구인 지통(紙桶)일 뿐이다. 한지 제조와 인쇄술의 중심지는 본래 사찰이었다. 송광사와 보경사 안내판에는 지통이 ‘비사리 구시’인데, 사찰의 큰 행사 때 공양간에서 수천 명 분의 밥을 지어 퍼 담는 용도로 썼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설명을 하고 있다. 징광사(澄光寺), 송광사, 통도사, 범어사, 옥천사, 석남사, 간월사 등 다른 사찰들처럼 보경사도 백성들을 대신하여 얼마나 국가 관청의 가혹한 닥종이 공납 강요로 고통을 당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조선 중기의 기록에는 보경사 주변에는 온통 닥나무 밭이었다고 한다. &lt;보경사사적기&gt;(1792)에는 ‘보경사는 산이 좋아, 양반 관료들의 산놀이에 스님들이 가마꾼이 되고, 절은 숙식을 제공하는 여관이 되고, 물이 좋아 종이 제조 노역에 시달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13 보경사 지통&gt;</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21731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6F1A4152E264B91C"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46F1A4152E264B91CB778"/></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사대부들이 산놀이 온 내연산</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청하현감으로 왔던 문장가 백운거사(白雲居士) 옹몽진(邕夢辰)이 내연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서 돌아가는 길에 퇴계의 문인으로서 사대부 사회에서 명망이 높던 경주부윤 구암(龜巖) 이정(李楨, 1512-1571) 선생에게 내연산의 아름다움을 알렸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내영산에 노닒&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遊內迎山</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오늘 아침 구름 안개 활짝 개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今朝雲&#32755;豁然開</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종일토록 냇물의 근원을 찾아 푸른 이끼를 밝았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盡日窮源踏翠苔</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꽃과 버들 산에 가득한데 누가 있어 그 뜻을 헤아릴까?&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花柳滿山誰會意</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한 줄기 계곡물, 바람과 달만이 홀로 서성이는 것을.&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一川風月獨徘徊</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구암선생문집(龜巖先生文集)&gt;&gt;(원집(原集)) 권1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내영산에 노닒&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遊內迎山</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냇물이 돌고 골이 굽으며 길이 층층이라,&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川回谷轉路層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힘을 다해 걷고 끌며 차례로 오르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盡力&#36491;&#25203;次第登</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열두 폭포 흘러흘러 쉼이 없어도,&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十二瀑流流不息</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근원의 샘물 한 줄기 본래 맑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源泉一脈本淸澄</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구암선생문집(龜巖先生文集)(속집(續集)) 권1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1562년 구암의 내연산 유산으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앞 다투어 내연산의 진달래꽃과 단풍을 찾아 왔다. 그들은 경관에 이름을 부여하며 명소들이 주는 의미와 감흥을 문학으로 표현하며 인격을 닦았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1587년에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은 아들을 잃고 울적해 하던 숙부 대해(大海) 황응청(黃應淸)을 모시고 울진 기성 사동리에서 출발하여 청하읍성의 해월루(海月樓)와 월포 조경대(釣鏡臺)에 올랐다. 임진왜란 진주성 혈전의 영웅, 영해부사 최경회와 청하읍성의 동문(부옹문) 앞에서 작별을 하고서 내연산을 이틀 동안 유산하였다. 그의 내연산 여행기, &lt;유내영산록(遊內迎山錄)&gt;은 단행본으로도 유통되었을 만큼 기행문학의 백미이다. 뛰어난 문학성과 세밀한 기록성을 지니고 있어서 인문학의 공간인 내연산을 읽는 고전이 된다. 내연산이 있어서 이토록 빼어난 글이 탄생하였고, 이렇게도 아름다운 문장이 있어서 우리는 내연산의 마음을 읽고 감동에 젖을 수 있다. 그는 적멸암(寂滅庵)과 용추(龍湫)와 월영대(月影臺)와 선열대(禪悅臺)에서 슬프도록 깊은 아름다움과 장쾌한 감흥을 유감없이 표현하였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1688년 음력 5월 초에 내연산을 찾은 원주의 대학자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은 문수암과 내원암에서 묵었다. 문수암에서는 수백 리 둘레의 호수 같은 영일만을 굽어보았고, 내원암에서는 바위틈에 피어난 함박꽃을 완상하며 그곳이 산중 제일의 터라고 하였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인이었던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1550-1615) 부자, 홍문관 부제학 취흘(醉吃) 류숙(柳潚, 1564-1636), 원주의 대학자로 &lt;&lt;산중일기(山中日記)&gt;&gt;를 남긴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과 그의 문인 노애(蘆厓) 류도원(柳道源), 청성 성대중, 농수 최천익, 모두가 내연산에서 노닐며 인품을 닦았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내연산의 명소 이야기</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동석암에 묵으며 宿動石庵</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높고 낮은 나무꾼들의 길이 맑은 계곡물을 둘러싸고, 高低樵路繞淸泉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절은 단풍 비단 숲가에 있다. 寺在丹楓錦繡邊</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스님과 뜬 구름은 지는 해로 돌아가고 僧與浮雲歸落日</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객은 호학산을 따라서 신선의 세계로 들어간다. 客從呼鶴入諸天</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천년의 동석이 새로운 얼굴을 만나고, 千年動石逢新面</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하룻밤의 등잔불은 숙세의 인연을 안다. 一夜懸燈認夙緣</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종소리 몇 번이나 어디서 일어나는가. 鐘磬數聲何處起</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앞 봉우리가 지척인데 진선이 있다. 前峯咫尺有眞仙</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취흘집(醉吃集)&gt;&gt; 권3</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국가가 편찬한 지리지, &lt;&lt;신증동국여지승람&gt;&gt;에는 ‘내연산에 대&#8228;중&#8228;소의 세 바위가 솥발모양으로 벌려있는데, 사람들이 삼동석이라고 한다.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조금 움직이지만, 두 손으로 흔들면 꿈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삼동석(三動石)은 내연산의, 삼용추(三龍湫)는 신구산의 랜드마크로 여겼다. 포항에는 내연산이 있고, 내연산의 상징 경관은 삼동석이고, 대표 경관은 삼용추인 것이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14 내연산 삼용추의 관음폭포, 관음담, 관음굴, 학소대, 학소두&gt;</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35674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543D4252E264DA0F"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3543D4252E264DA0F2903"/></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 &lt;사진15 내연산 삼동석&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56681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64A14252E264F109"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764A14252E264F10914B1"/></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조선시대 오백년 동안 삼동석을 방문하고 유일하게 시문을 남긴 사람은 취흘이다. 국왕, 광해군이 쿠데타로 쫓겨나고 &lt;&lt;어우야담(於于野談)&gt;&gt;으로 유명한 숙부 류몽인(柳夢寅)에 연루되어 취흘이 청하로 귀양 와서 열네 해를 살았다. 그가 1625년 단풍철에 산림보호표지석인 봉표석(封標石)이 있는 호학산을 넘고, 삼동석 곁의 암자, 동석암에서 묵었다. 1636년 봄에 청하현감 심동귀(沈東龜)와 삼동석을 다시 찾았을 때, 동석암은 이미 폐암이 되었다. 그도 &lt;&lt;신증동국여지승람&gt;&gt;을 열람하고 삼동석을 찾았고, 교유하던 사람들에게 늘 삼동석이야말로 내연산의 상징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삼동석이 단풍숲가에 있고 큰 종 모양이라고 하였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청하 내연산을 지나가며&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過內迎山在淸河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골짜기 입구에 눈과 얼음 쌓여 있어서,&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洞門積氷雪</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병든 나그네 다시 찾아가기 어렵구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病客難重尋</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다른 날 나를 받아준다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他日如容我</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근원을 찾아 산 속 깊이 가길 마다않으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窮源不厭深</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구암선생문집(龜巖先生文集)&gt;&gt; 권1 속집(續集)</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필자는 취흘의 시문을 읽고 2013년 3월 10일 아침 일찍 보경사에서 출발하여 경북도립수목원 부근의 선바위까지 삼동석과 동석암 암자터, 주연(舟淵)을 찾아서 내연계곡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아직도 잔설이 있고 그늘에 얼음이 있었다. 계곡 가의 속칭 선바위와 두 바위가 삼각형으로 상중하에 벌려 있고, 부근에 2곳의 암자터가 있고, 그 하류에 주연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취흘이 찾아와 암자에 묵어 간 이래로 거의 4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찾지 못하였고, 마침내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라졌던 삼동석을 되찾는 실로 감개무량한 순간이었다. 산을 돌아내려오며 보경사 일주문 앞에 서서 우러러본 밤하늘에 별들이 치렁치렁하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삼동석과 삼용추를 비롯하여 내연계곡에서 필자는 50여 개의 명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에 이르러 잊히고, 와전되고, 잃어버린 내연산의 명소들과 암자들을 해월의 &lt;유내영산록&gt;을 읽고 거의 되찾을 수가 있었다. ‘삼동석 곁에는 두 승암(僧庵)이 있으며 그곳에는 ‘입에서 물을 뿜는’(도교 신선술 수련) 자들이 산다. 주연이 삼동석 십리 하류에 있으며,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깊다. 보경사 적광전 뒤에 지장전이 있고, 지장전 뒤에 관음각이 있다.’고 하는 등의 정보는 &lt;유내영산록&gt;에만 유일하게 등장한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16 내연산 주연&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24742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7DA34352E2650816"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47DA34352E2650816AEB5"/></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보경사에서 출발하여 첫 길목으로, 산신제단이 있는 곳의 높이 치솟은 바위가 낙호암(落虎巖)이다. 청하현의 유생, 김득경(金得鏡)은 해월 일행의 유산에 동행하여 ‘범이 떨어져 죽어서 이름이 낙호암이라고 안내하였다. 그 오년 뒤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 곽재우 의병장이 지휘하는 의령 정암진 전투에서 김운의 후손인 김득경 부자는 전사하였고, 청하 서정리에 부자의 망묘단(望墓壇)이 있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문수암과 보현암이 갈라지는 곳에 가로세로로 갈라진 마당 바위가 문수대(文殊臺)이다. 그 아래 벼랑 밑이 협암(挾巖)이다. 보경사에서 문수대까지 이르는 계곡이 무풍계(舞風溪)이다. 문수대에서 수십 걸음 거리에 벼랑길 오르막이 나오고 길가에 난간이 이어지고 바위 사이의 절벽 허공에 나무다리를 놓아두었다. 승선교(昇仙橋)인데, 태평교나 낙하교(落霞橋)로도 불렀다. 옛날에는 소나무로 잔교(棧橋)를 걸쳐 놓았는데, 근심걱정 없고 노을 지는 신선계의 태평한 시공으로 들어간다는 뜻의 이름이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벼랑길을 굽어 돌아 내려가면 계곡 가에 너른 암반이 나온다. 해월은 여기서 갓을 벗고 머리를 감았고, 숙부와 김득경, 보경사 학연(學淵) 스님은 바위 돌에 솥발 모양으로 벌려 앉아서 물에 두 발을 담그고 전복술잔에 술을 따르고, 시를 읊조리며 쉬어 갔다.</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내연계곡의 첫 쌍둥이 폭포가 바로 사자폭(獅子瀑)이다. 이른바 상생폭은 20세기에 쌍폭이라서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그 아래의 깊고 푸른 못이 사자담(구연(龜淵), 기화담)이다. 사자담 남쪽에 네 줄의 층암이 병풍처럼 솟아 있다. 그 중에 서쪽 끝의 것이 기생과 선비가 올라가 놀다가 기화담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기화대(妓花臺)이다. 쌍둥이 폭포 사이에 못으로 기어 내려오는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낙구암(落龜巖)이고, 폭포 위의 시원하게 뚫린 계곡이 활연문(豁然門)이다. 폭포 옆으로 바위벼랑에 돌을 쌓아 겨우 사람이 다니는 길을 내었는데, 이 모퉁이가 사자항(獅子項)이다. 소동파의 게송처럼 사자폭포는 밤낮으로 사자후를 토한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17 내연산 사자폭, 활연문, 낙구암, 사자담&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19621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43603E52E2651D09"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243603E52E2651D09783D"/></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조정을 비난하였다는 시를 지었다는 필화(筆禍)를 입어 황주(黃州)로 귀양 가 동쪽 언덕을 갈아 농사지으며 네 해 동안 살던 송나라의 소동파(蘇東坡)가 신종 원풍 7년(1084)에 황주를 떠나 여주(汝州)로 유배지를 옮겨가면서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의 벗, 상총(常總) 선사를 만나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선불교의 공안(公案)인 ‘무정설법(無情說法)’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게송을 지었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동림사 상총 장로 스님께 드림&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贈東林總長老</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계곡의 물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長廣舌)이니,&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溪聲便是廣長說</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산의 빛깔이 어찌 청정한 몸이 아니겠는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山色豈非淸淨身</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밤이 오자 팔만사천 게송을 설하니,&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夜來八萬四千偈</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훗날 남에게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他日如何擧似人</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한다. 상생폭이라고 인식하는 오늘 우리는 사자폭포의 우렁찬 사자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밤낮으로 흐르는 내연산 계곡물이 팔만사천 게송을 설법하는 부처님의 장광설이고, 계절마다 볼 수 있는 찬연한 산색이 법신불의 청정한 몸임을 알아차릴 눈이 있는가. 사자항, 사자폭(獅子瀑), 사자담(獅子潭)은 오늘에 되찾아야할 보배롭고도 귀중한 이름들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사자쌍폭을 지나서 보현폭이 병풍에 둘러싸여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채, 물소리만 바위벽에 울려 메아리친다. 여기서 계단의 중간쯤에 오르면 신라시대에 창건된 하문수암(下文殊庵)터 돌축대가 화살대숲 사이로 북쪽에 보인다. 하문수암터에서 동쪽으로 백 걸음 가면 견상암(見祥庵, 견성암(見性庵))터가 나온다. 그곳의 노송이 자라는 암대가 견성대(見性臺)이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계단을 다 오르면 보현암(普賢庵)으로 오르는 길목에 암반이 계곡 가 벼랑 위에 있는데, 습득대이다. 그 위의 보현암 자리가 한산대이다. 주변에는 늠름한 노송들이 좋다. 한산(寒山)과 습득(拾得)은 당나라 때의 괴승으로 문수와 보현, 두 보살의 화신이었다고 한다. 신라&#8228;고려 시대, 선종 불교문화가 발달하던 시기에 붙여진 이름들이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18 내연산 보현암, 한산대&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76033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513C4552E265331F"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1513C4552E265331F7003"/></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보현암을 서쪽으로 돌아가면 나무 정자가 있는 쉼터가 있다. 주변에 기와조각들이 흩어져 있으며, 건물 토대가 보인다. 적멸암(寂滅庵)터다. 그곳의 길목이 적멸항이다. 해월은 적멸암에서 묵어가며, 여행기에 이렇게 썼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외로운 연기가 석양에 오르고 어둑어둑 땅거미가 졌다. 불당에 들어가 베개를 높이하고 누우니 바람과 냇물이 세차서 골을 울리는데, 바람소리의 울림이 영롱한 음성이었다. 사람으로 하여금 뼈를 차게 하고, 혼은 벌써 깨어나게 하였다. 밤은 일경(一更)인데 달이 산봉우리에 걸렸고, 달그림자가 못 가운데에 떨어졌다. 성글게 돋아난 별이 빛나고, 은하수가 비껴 돌았다. 적막하여 한 마리 새도 울지 않으니, 참으로 산중의 절경이었다. 팔월 칠일 갑자. 잠든 객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숲 끝에 이미 붉은 해가 걸렸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해월선생문집(海月先生文集) 권8 &lt;유내영산록(遊內迎山錄)&gt;</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적멸항에서 작은 다리를 건너면 길가의 바위에 사람 하나가 앉을 만한 구멍이 있다. 풍혈(風穴)이다. 삼용추에 이르러 하용추인 잠룡폭(潛龍瀑)을 굽어보고, 동쪽 위의 암벽 아래로 올라가면 커다란 굴이 있고, 그 앞에 석축이 있다. 해월이 서하굴(栖霞窟)이라고 명명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19 내연산 서하굴</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34477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2F7A3F52E265450E"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32F7A3F52E265450E42CA"/></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현수교 아래 쌍폭이 중용추인 관음폭(觀音瀑)이고 그 아래가 관음담(감로담(甘露潭))이며, 움막 같은 두 바위굴이 관음굴이다. 관음폭 위의 웅장한 폭포가 상용추인 연산폭(내연폭, 여래폭, 용추)이고, 그 아래 못이 용담(龍潭)이다. 용담 아래에 또 다시 못을 이루며 물은 관음폭을 이룬다. 용담의 북쪽 암벽이 학소대이고, 학소대의 동쪽 위쪽에 길이가 일 미터 정도 되는 장방형의 감실이 있는데, 학의 둥지라는 학소두(鶴巢竇, 학소, 청학소)이다. 노을은 신선경을 말하고, 청학은 신선이 타고 다니는 새이다. 선인들은 삼용추를 신선경(神仙境)으로 여겼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용담 남쪽 암벽 아래에 물이 고인 바위 구덩이가 있고, 암벽에도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어서 비를 피할 만하다. 취흘이 상용추 위의 수리더미 중턱에 있던 내원암(內院庵)에서 묵고, 다음날 구기자술을 마시고 계곡 주변에서 약초를 캐다가 비를 만났다. 그는 물의 신령스러운 기운, 미르(용)가 깃들어 사는 용담 곁의 이 움푹 들어간 공간에서 비를 피하였다. 함께했던 승려들의 요청으로 그 공간을 피우석(避雨石)이라 하여 미르의 영험스러움을 드러내고, 장자(莊子)에 부끄럽지 않다는 의미를 붙여 상용추를 적선담(謫仙潭-적선은 이백의 별칭)이라고 하였으며, 약초를 캐고 구기자술을 마시며 신선술을 연마한 사람들이 노닐었다고 삼용추 계곡을 구기동(枸杞洞)이라 명명하였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늦봄에 내연산에 노닐다 고문수암에 묵으며 설희 스님과 황정경을 토론하고서 시를 지어 스님에게 줌</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暮春遊內延山 宿古文殊 與雪&#29013;上人討論黃庭經 仍以詩贈之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삐걱대는 가마타고 허공으로 들어가고,&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伊軋藍輿入半空</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여러 하늘 멀리 저녁 구름 속에 있구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諸天遙在暮雲中</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산은 봉래산을 갈무리하여 연꽃이 희고,&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山藏蓬島蓮華白</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땅은 무릉도원을 숨기고 있어 비단 물결 붉구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地&#31061;桃源錦浪紅</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여기서부터 고승이 도의 기운 많은데,&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自是高僧多道氣</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누가 귀양객이 또한 신선 늙은이인줄 알리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誰知謫客亦仙翁</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황정경 강론을 마치니 향연이 일고,&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黃庭講罷香煙起</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쌍학이 너울너울 저녁 바람에 춤추는구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雙鶴&#36417;&#36506;舞晩風</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취흘집(醉吃集)&gt;&gt; 권3</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조선시대에 유교와 불교를 소통 시킨 언어는 노장 사상과 도교 문화이었다. 계조암과 문수암은 영일만과 주변 지역이 굽어 보일만치 전망이 좋다. 계조암에는 경사(經史)에 밝고 &lt;&lt;장자(莊子)&gt;&gt;에 통달한 덕경(德瓊) 스님이, 고문수암에는 신선술을 닦으며 도교 경전인 &lt;&lt;황정경(黃庭經)&gt;&gt;에 조예가 깊은 설희(雪熙) 스님이 머물렀다. 취흘은 이 두 스님과 시를 주고받으며 유불도, 삼교의 경계를 넘어 근원의 지평에서 그들과 만나 고달픈 귀양살이의 벗으로 삼았다. 그는 덕경과 설희 스님에게 주는 시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20 내연산 보경사 고문수암&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59571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16774152E2655A11"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616774152E2655A11CAE3"/></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청하가 길이 끊어지고 아주 멀리 있음은 한유(韓愈)가 귀양 가 승려 태전(太顚)과 사귀었던 조주(潮州)에 밑지지 않고, 유종원(柳宗元)이 유배가 승려 호초(浩初)와 벗이 되었던 용성(龍城)의 빼어난 경치가 내연산에 높지 않다. 그들 당시의 방외(方外)의 사귐과 사령운(謝靈運)이 나막신에 밀랍을 칠하고 산수를 즐긴 일과 소동파(蘇東坡)가 등잔불 켠 선방에 묵어간 일과 비교할 수 있다. 혹은 꽃과 달로 서로 기약하고, 시편으로 서로 화답하고, 호사를 칭찬하여 베풀고, 늙은 나이에 우아하게 노닐어 나로 하여금 거친 곳에 즐겁게 머물게 하고, 그 귀양살이를 편안하게 하며, 그 근심을 풀어내게 하는 것은, 실로 이 두 분의 도움이니, 남들이 비록 벗이 아니라고 하여도, 나는 반드시 벗이라고 이를 것이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취흘집&gt;&gt; 권5 &lt;내연산 덕경, 설희 스님들께 드리는 시의 서문(贈內延山人德瓊,雪&#29013;詩序)&gt;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여름철, 비가 내리고 수량이 풍부하면 웅장한 소리를 밤낮으로 울리며 용담에는 시퍼런 물이 울컥울컥 소용돌이친다. 놀랍게도 그 물 속에 피라미가 물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다. 경이로운 생명력이다. 연산폭포 물줄기가 용담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는 미세한 물 알갱이들에 햇빛이 비추어 들면 무지개가 선다. 1626년, 청하 고을에 입하 뒤로 칠십 일 동안 가뭄이 들자, 현감 이립(李砬)은 용담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그날 밤, 그는 용담 가의 바위에서 한데 잠을 자며 자신의 부덕을 참회하고 근신하였다. 목민관의 정성에 용신이 감응하여 이튿날 비가 흡족히 내렸음은 물론이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21 내연산 삼용추의 상용추 연산폭과 용담&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29782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608A4552E265741A"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4608A4552E265741A86AD"/></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관음담 서쪽 암벽이 월영대(月影臺)이다. ‘청풍명월’에서 밝은 달에 짝할 맑은 바람이 없어서 월영대 입구의 돌문을 청풍문이라고 해월이 명명하였다. 그러자, 홀연히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고 사람들은 바람신이 있어서 해월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다. 해월은 그곳이 ‘달이 뜨고 솔 그늘에 달빛 그림자 지면 불국정토를 이루어 산의 한 승경이라’고 하였다. 낙재는 대비암에서 저녁밥을 먹고 월영대에 올라 교교한 달을 보며 밤을 지새고, 아침 해를 맞았다. 취흘은 월영대를 명월대라고 하였고, 관음담 주변에 바위 감실이 숭숭하여 우담은 월영대를 중허대(中虛臺)라고 하였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22 내연산 월영대&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32516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34E94152E2658904"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534E94152E26589042737"/></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취하여 축융봉을 내려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醉下祝融峰</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만리 길을 바람 타고 와서 보니,&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我來萬里駕長風</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골짝의 뭉게구름이 가슴을 틔워준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絶壑層雲許&#30442;胸</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탁주 세 사발에 호기가 솟아,&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濁酒三杯豪氣發</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낭랑히 읊조리며 축융봉을 날듯이 내려온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朗吟飛下祝融峰</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남악창수집(南岳唱酬集)&gt;&gt;</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영남 퇴계학의 정맥을 잇는 대학자 대산 선생이 연일현감으로 부임하여 1754년 봄에 농수 선생, 의민 스님과 함께 학소대 위쪽의 계조대에 자리 잡은 계조암(繼祖庵)에서 &lt;&lt;논어&gt;&gt; 몇 장을 강의하였다. 그리고 계곡물을 건너서 남쪽의 대비암으로 가다가 월영대에 올라서 대 이름을 물었다. 기하대라고 하자, 대산은 주자가 벗들과 어울려 중국의 남악, 형산(衡山) 축융봉을 유산하고 지은 시, &lt;취하여 축융봉을 내려옴(醉下祝融峰)&gt;의 제4구 ‘朗吟飛下祝融峰(낭음비하축융봉)’을 들어보았느냐며 의민 스님에게 물었다. 이 시구의 ‘비하’에서 이름을 취하여 명명하였지만 소리가 와전되어 ‘기하(妓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비하로 암대 이름을 고치도록 하였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65년 뒤에 청하현감으로 부임한 대산의 손자 이병원(李秉遠)은 &lt;&lt;농수집&gt;&gt;을 읽고서 비하대에 올라 조부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감격하였다. 석공으로 하여금 ‘大山先生命名 飛下臺(대산선생명명 비하대)’라고 하는 큰 글자를 바위 윗면에, 동행했던 이병원 형제, 아들, 친구의 이름을 바위 동면에 새기게 하였다.</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23 내연산 월영대 대산선생 명명 비하대 각자&gt;</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78479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67ED4252E2659D0A"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667ED4252E2659D0A5C72"/></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학소대와 마주하는 월영대 벼랑 끝에는 노송 두 그루가 있다. 해월의 여행기에도, 겸재 정선의 &lt;고사의송견남산도(高士倚松見南山圖)&gt; 부채그림에도 이 노송이 등장한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24 겸재 정선의 고사의송견남산도&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54061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034A4152E265B01C" width=639 actualwidth="639" exif="{}" id="A_22034A4152E265B01C393B"/></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황여일 일행은 월영대 남쪽, 잠룡폭 곁에 장엄하고 웅장하게 치솟은 바위봉우리, 선열대(禪悅臺)에 보경사 학연(學淵), 계조암 신오(信悟), 대비암 신전(信全) 스님들의 안내로 올랐다. 황여일이 묘입문(妙入門)이라고 명명한 월영대 남쪽의 바위문을 지나면 사방이 닫혀 감옥처럼 깊은 계곡 바닥이다. 그곳에 나무다리가 있었는데 황여일이 충소교(沖宵橋)라고 명명했다. 다리를 건너 다시 가파른 벼랑에 난 조도(鳥道)를 기어서 올라가면 그곳에 두 암자터가 있다. 정방형의 넓은 백운암터, 그 남쪽 아래의 장방형의 좁은 운주암터가 있다. 백운암과 운주암을 합하여 선열암이라고 하였다. 신라&#8228;고려시대 이래로 수행자들이 머물며 선열에 잠겨 깊은 수행을 하였던, 속세를 초탈한 도량이었다. 겸재의 &lt;청하내연산폭포도&gt;에 두 암자의 모습이 보인다. 지금은 속칭 선일대(仙逸臺)라고 하지만 선열대의 와전이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25 내연산 선열대&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54919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A3C3E52E265C21B"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41A3C3E52E265C21B803F"/></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백운대에 붙임&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題白雲臺</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푸른 하늘에 치솟은 금빛 연꽃 봉우리요,&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靑天削出金芙蓉</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꼭대기에서 곧바로 쏟아지는 두 줄기 흰 폭포수이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絶頂直垂雙白龍</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옛 절벽이 가파르고 가파른데 참선하는 스님 야위었고,&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古壁&#24009;&#24009;道骨瘦</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가을 못은 고요하고 고요하여 신령스런 바람피리 소리 비었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秋潭寂寂靈&#31839;空</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동해바다가 지척인데 해가 백운대의 겨드랑이에 솟고,&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東溟咫尺日生腋</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북두칠성을 우러르니 구름이 가슴을 트이게 한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北斗低仰雲&#30442;&#33015;</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다시 층층 발아래에 월영대이고,&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更下層層月影石</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외로운 연기 올라오는 암자에서 맑은 종소리 들려오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孤烟蘭若送淸鍾</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해월과 숙부 대해 선생은 선열대에서 암자의 스님들이 지은 푸른 채소 반찬에 흰밥을 먹고 머루주를 걸러 마셨다. 높고 높은 선열대 위에서 휘파람을 불고, 시를 읊었다. 발아래 삼용추가 한 방울 물이고, 보경사가 메추라기 둥지처럼 작게 보이더라고 하였다. 동해 만경창파에 씻고서 밤낮으로 해와 달이 뜨고 지며, 은하수가 흐르는 우주를 관조하였다. 때맞추어 청하현감 매당(梅堂) 조정간(趙廷幹)이 시를 보내오기도 하였다. 해월은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흰 구름이 허리에 걸리는 선열대를 백운대로 개명하였다. 선열대는 삼용추에서 올려다보면 암봉이기에 선열봉이라고 하였고, 운주암이 있기에 운주봉이라고도 하였으며, 속칭 기화봉이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오암 스님은 이러한 풍경 속에서 출가 수행승으로 사는 당신의 내면 풍경을 시로 읊었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나의 넋두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自諷</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운주봉으로 붓을 삼고,&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雲住峯爲筆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용추로 벼루를 만들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龍湫作硯池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일만 겹으로 펼쳐진 바위 병풍에,&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巖屛開萬疊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뜻 가는대로 나의 시를 쓰리라.&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隨意寫吾詩</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오암집(鰲巖集)</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진경산수화 속의 내연산</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원백의 청하 부임에 줌&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贈元伯之任淸河</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미원장 늙어 미쳤다 성내지 말게,&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不忿元章老且顚</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가는 곳마다 비단과 먹 싣고 배를 띄웠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32273;煤隨處載行船</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겸옹의 이 걸음도 좋은 물건 없고,&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謙翁此去無長物</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주역도 오직 옛날에 강하다 남은 헌책뿐이라.&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羲易惟殘舊講篇</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영남 사람 응당 사또 이름 알 테니,&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嶺人應知使君名</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복사꽃 오얏꽃 산에서 피고,</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도리산은 청하 봉수대가 있는 산)</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학이 춤추며 맞으리라.</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호학산은 청하읍 진산)&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桃李山開舞鶴迎</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해당화 피고 백사장 다 밟고 나서 멀리 배를 부르게,&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踏盡棠沙遙喚艇</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죽서루 위에는 우리 형님 계시니.&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竹西樓上有吾兄</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순암집(順庵集)&gt;&gt; 권4</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간송미술관장 최완수 선생의 &lt;&lt;겸재 정선 진경산수화&gt;&gt;를 읽어보자. 퇴계의 성리학 이해가 무르익고 율곡이 조선 성리학 사상을 열어나가자 조선 고유의 문화가 탄생하였다. 글씨는 석봉 한호, 문장은 간이 최립, 시는 사천 이병연, 그림은 겸재 정선이 진경문화를 창조하였다. 인조반정과 병자호란을 겪고 명이 만주족 오랑캐에게 망하자, 천하에 유교 문명의 빛은 이제 조선에만 있다고 여긴 사대부들은 우리 땅이야말로 천지의 밝고 맑은 기운을 머금은 참된 경치, ‘진경(眞景)’이라고 자부하였다.</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26 겸재 정선 내연삼용추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50594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419A3D52E265DA03" width=819 actualwidth="819" exif="{}" id="A_21419A3D52E265DA03B9A4"/></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인왕산 아래에 세거하던 율곡의 학통을 이은 서인 노론 세력의 백악사단(白岳詞壇) 중에 좌의정 조문명, 경상감사 조현명 형제, 영조의 사돈이고 추사 김정희의 고조부인 우의정 김흥경의 후원으로 죽서루가 있는 삼척에는 사천 이병연을, 내연산이 있는 청하에는 겸재 정선을 보내어 진경을 시와 그림으로 짓고 그리도록 영조는 배려하였다.</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27 겸재 정선 내연삼용추도, 호암미술관 소장&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19337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2DCA4152E265EC0A" width=428 actualwidth="428" exif="{}" id="A_262DCA4152E265EC0A898D"/></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58세의 겸재가 1733년 봄에 청하현감으로 부임하여 1735년 5월 모친의 별세로 60세에 떠날 때까지 겸재는 재임하며, 내연산과 경상도 일대의 산수를 사생하는 여행을 하였다. 이 시기에 &lt;내연삼용추도&gt; 2점, &lt;청하내연산폭포도&gt; 1점, &lt;청하성읍도&gt; 1점도 그렸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lt;내연삼용추도&gt;는 삼용추의 깎아지른 바위 절벽을 서릿발 같은 상악준과 도끼로 길게 내리 쪼개는 듯한 장부벽준으로 장쾌하게 그리고, 미가산법(米家山法)으로 삼용추 절벽 위의 솔숲을 물기 있게 그려서 흙산을 표현하였다. 그림은 음양이 조화되어 기운이 생동한다. 59세가 된 겸재의 진경화법은 이 시기에 원숙한 경지에 들어가 &lt;금강전도&gt; 1점을 그리고, 내연산의 삼용추라는 신선경을 만나 피우석에 ‘鄭敾 甲寅 秋’(정선 갑인 추)라는 각자를 남겼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28 겸재 정선 자화상&gt;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62055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0B353E52E2660224"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10B353E52E2660224E066"/></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1688년 내연산의 암자들을 찾아왔던 우담 선생이 삼용추에 산의 기운이 모두 모여 있어서 금강산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곳이 사랑스러워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다. 삼용추에 산놀이 왔던 시인 묵객들은 붓으로 바위에 이름과 시를 적었고, 벼슬아치들은 정으로 이름을 파고 붉은 칠을 하였다. 바위벽에 새겨진 이름들은 현재 360여 개를 확인할 수 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29 내연산 삼용추의 정선 갑인 추 각자&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98916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33BE4152E2661807"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233BE4152E266180790F6"/></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 그 가운데에는 류숙, 일본에 통신사로 가서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조엄, 추사 김정희의 생부인 김노경, 경주부</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의 기생 달섬도 눈에 띈다. 청하현을 비롯하여 흥해, 경주, 영천, 영덕, 하양 등의 지방관들이 기생을 동반하여 내연산에서 산놀이를 하였다. 내연산 명소들 중 기화대, 기하대, 기화담, 기화봉 같은 속칭들이 생겨난 까닭이다.</SPAN> </P>
<P>&nbsp;</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P></SPAN>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아끼고 사랑해야 할 내연산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그러나 내가 우연한 기회에 처음으로 목련을 보고 알아내게 된 것은 사십이 훨씬 넘어서의 일이었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경북(慶北) 청하(淸河)에 있는 보경사(寶鏡寺)를 처음으로 찾았을 때의 일이었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보경사의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문안으로 들어서자, 거의 아름드리나 되는 큰 나무에 진한 자줏빛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두 길이나 넘는 큰 나무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꽃들이 필 수가 있나 하고 생각하자 그것이 목련인 것을 남에게 묻지 않고도 곧 알 수가 있었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거의 연꽃만큼 크기도 하지만 연꽃같이 쫑긋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였다. 어쩌면 두부장수의 손종을 거꾸로 세워 놓은 듯한 모양 같기도 하였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갈피갈피 겹쳐서 펼쳐진 꽃잎들을 들여다보면 옥수수 이삭을 짜개서 펼친 듯한 모양이기도 했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한흑구, &lt;흰 목련&gt;</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lt;사진30 보경사 경내의 흑구 한세광문학비&gt;</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80509_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75174352E2663222" width=1024 actualwidth="1024" exif="{}" id="A_2775174352E2663222A92D"/></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ff0000; FONT-SIZE: 10pt"></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흑구 한세광은 젊은 시절 미국 시카고의 놀스파크(North Park)대학 영문학과, 필라델피아의 템플대학 신문학과에서 수학하였다. 민족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도한 흥사단 사건으로 투옥도 되었고 해방 후 조만식 선생을 따르기도 하였으며, 월남하여 미군정청에 근무하다가 1948년에 포항으로 이주하여 평생을 살았다. 교과서에도 실린 대표작, 수필 &lt;보리&gt;를 비롯하여 주옥같은 수필, 시, 소설들을 남겼다. 그의 문학비가 보경사 경내에 있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언어로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은 이름으로 자연 경관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신을 고양하고, 성정을 보존하고 키우며, 문명을 가꾸어 나간다. 상생폭은 사자폭으로, 선일대는 선열대로 어서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 잊히어졌던 50여 명소들과 버려진 10여 암자터, 산신제의 민속문화 현장 등에는 안내판을 세우자. ‘내연산 숲길’ 걷기와 스토리텔링으로 우리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되살려 내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하고도 고귀한 문화유산이다. 또한 얼레지꽃, 참나무와 소나무, 물까마귀, 버들치 등 내연산이 품고 있는 풍부한 동식물 생태계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은폭 상류는 폭포, 못, 바위, 암대가 어우러져 그 하류보다 더욱 그윽하고 사랑스러운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훼손 되지 않도록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좋겠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우리시대는 과연 우리 선조들만큼 내연산을 알고, 내연산의 경관에서 의미를 깊게 읽어내는가? 선열대에서 계조암터까지 길이 200미터의 현수교를 놓고, 보경사에서 삼지봉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 수입 올리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현실이 한없이 슬프다. 오늘 우리는 내연산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포스코와 포항시에서 후원하여 지역의 방송국에서 내연산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기록한 영화를 제작하고, 자연&#8228;역사&#8228;문화 탐구 보고서를 펴내면 좋겠다. 내연산을 성찰과 교육,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자. 내연산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물고기 한 마리까지 사랑하고 아끼자. 이런 연후에야 억만년토록 묵묵하게 그곳에서 뭇 생명을 품고 사는 내연산이 우리 인간에게도 무한한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lt;&lt;작가정신&gt;&gt;제14호(2014, 사)한국작가회의 경북지회 &lt;&lt;작가정신&gt;&gt; 편집위원회)</P>
<!-- -->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내연산 한시 산책
김희준
추천 0
조회 237
14.05.01 15:0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