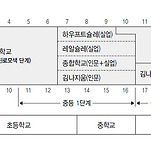<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독일 최저임금제 도입 논란에 대해</SPAN></B><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lang=EN-US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B></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SPAN lang=EN-US><FONT face=바탕 color=#000000>(</FONT></SPAN><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사회정의 실현인가<SPAN lang=EN-US>, 근로기회 축소인가?)<o:p></o:p></SPAN></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SPAN lang=EN-US><o:p><FONT face=바탕 color=#000000>&nbsp;</FONT></o:p></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WORD-BREAK: keep-all;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mso-margin-top-alt: auto; mso-margin-bottom-alt: auto; mso-pagination: widow-orphan"><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독일 내 </SPAN><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최저임금제</SPAN></B><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도입 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SPAN lang=EN-US>. 이는 2004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사민당 의장 <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프란쯔 뮌테페링</B> 의원이 실직자 사회복지 법안인 ‘Hartz Ⅳ’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그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강조하며 독일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제 논의를 공론화시켰다. 그리고 <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제 도입이 정당 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B> 사민당 소속 올라프 숄쯔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제 도입을 통해 시장지향성을 강화하고 유권자를 확보하려고 한다. 반면에 기민당 소속 미하엘 글로스 경제부 장관은 “정부 주도의 임금관리는 올바르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o:p></o:p></SPAN></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WORD-BREAK: keep-all;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mso-margin-top-alt: auto; mso-margin-bottom-alt: auto; mso-pagination: widow-orphan"><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정당 간 입장은 다양하다<SPAN lang=EN-US>. <o:p></o:p></SPAN></SPAN></B></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WORD-BREAK: keep-all;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mso-margin-top-alt: auto; mso-margin-bottom-alt: auto; mso-pagination: widow-orphan"><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기민<SPAN lang=EN-US>/기사연합, 자민당</SPAN></SPAN></B><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은 최저임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사민당</B>은 적극 찬성<SPAN lang=EN-US>, </SPAN></SPAN><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좌파당</SPAN></B><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은 최저임금<SPAN lang=EN-US> 8유로 이상 전제로 찬성, </SPAN></SPAN><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9966;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녹색당</SPAN></B><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은 부분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SPAN lang=EN-US>. <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안겔라 메르켈 총리는 최저임금제 도입 대신에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B> </SPAN></SPAN><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9966;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녹색당</SPAN></B><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의 경우 분야별 차등 최저임금제에는 찬성하지만<SPAN lang=EN-US>, 최저임금 상향 책정에 따른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실직자 증가를 염려</SPAN><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하고 있다<SPAN lang=EN-US>.<o:p></o:p></SPAN></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WORD-BREAK: keep-all;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mso-margin-top-alt: auto; mso-margin-bottom-alt: auto; mso-pagination: widow-orphan"><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여당</SPAN></B><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인 기민<SPAN lang=EN-US>/기사연합은 독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조합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분야별 임금 협상은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각종 사회보장 제도가 최저임금 대신해서 잘 작동하고 있기에 최저임금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제 도입 시 저소득 직종 40~60만 실직이 예상되고, 이는 저소득 직종이 많은데다 겨우 회복하고 있는 동독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다.<o:p></o:p></SPAN></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WORD-BREAK: keep-all;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mso-margin-top-alt: auto; mso-margin-bottom-alt: auto; mso-pagination: widow-orphan"><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정당간 논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독일 내 </SPAN><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여러 노동조합의 입장</SPAN></B><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이다<SPAN lang=EN-US>. NGG(식음료, 담배, 호텔, 케이터링 노동조합)와 ver.di(서비스연맹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제 도입에 찬성한다. DGB(독일 노동조합 연맹) 프란쯔 요셉 묄렌베르크 대표는 “구서독 내 정규직 근로자 12.1%가 평균 월급 2884유로(약 461만원)의 반에도 못 미치는 빈곤임금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평균 1500유로(약 240만원) 또는 </SPAN></SPAN><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시급<SPAN lang=EN-US> 8.7유로(약 13000원)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도입을 찬성</SPAN></SPAN></B><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한다”고 밝혔다<SPAN lang=EN-US>. 젠더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 도입이 절실하다. 같은 업무를 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대다수 조합원이 여성인 NGG는 이러한 이유에서 최저임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o:p></o:p></SPAN></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WORD-BREAK: keep-all;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mso-margin-top-alt: auto; mso-margin-bottom-alt: auto; mso-pagination: widow-orphan"><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반면에</SPAN></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IG Metall(금속산업연맹), IG BCE(광산, 화학, 에너지산업 연맹), IG BAU(건축, 산림, 노동연맹), TRANSNET(철도, 운송 노동자 연맹) 등은 업계간 담합에 의한 임금고정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최저임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측 입장 또한 대체로 부정적이다. BDI(독일산업연맹) 미하엘 로고브스키는 최저임금제 시행이 “안 그래도 과규제인 </SPAN><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노동시장의 비유연화를 심화할 것</SPAN><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이라며 <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반대 입장을 표명했다<SPAN lang=EN-US>.</SPAN></B><SPAN lang=EN-US> BDA(독일고용주연맹) 디터 훈트는 이것이 “저임금 직종의 장기간 고용을 저하시켜 게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사회체제, 노동시장 개편을 골자로 제안한 <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아젠다2010</B>을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o:p></o:p></SPAN></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WORD-BREAK: keep-all;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mso-margin-top-alt: auto; mso-margin-bottom-alt: auto; mso-pagination: widow-orphan"><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미국은 최저임금제 도입 후 일하는 극빈층이 증가했고<SPAN lang=EN-US>, 프랑스는 최저 임금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아서 (시간당 8.5유로, 약 13000원) 유럽연합 내 최대 비율인 근로자 중 17%가 수혜자라고 한다. 이처럼 미국과 프랑스는 최저임금제 도입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성공적인 경우도 있다.</B> </SPAN></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COLOR: blue;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1999년에 시간당 5.4유로 (약 8600원)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현재 7.35유로 (약11000원)를 유지하며 근로자 중 2%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기업소득과 근로자 소득 모두 증가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파급하고 있다.<o:p></o:p></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WORD-BREAK: keep-all;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mso-margin-top-alt: auto; mso-margin-bottom-alt: auto; mso-pagination: widow-orphan"><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독일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SPAN lang=EN-US>,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시행 중인</SPAN><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lang=EN-US>Hartz Ⅳ’ 법안</SPAN></B>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는 가운데<SPAN lang=EN-US>, 국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필요한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한창이다.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독일 스타벅스에서 한 시간 일하면 독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두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시급을 받는다<SPAN lang=EN-US>.</SPAN></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한국 스타벅스에서 최저임금으로 한 시간 일한다면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3770원을 받게 된다. 커피가 임금의 기준은 아니지만,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미 인력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독일의 최저임금제 도입 논란은 어쩌면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o:p></o:p></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B><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mso-bidi-font-size: 10.0pt">김유라<SPAN lang=EN-US> / 독일 본대학 정치학과 박사과정</SPAN></SPAN></B><SPAN lang=EN-US><o:p></o:p></SPAN></P>
<P></P>
<!-- -->
카페 게시글
독일관련 게시판
독일 최저임금제 도입 논란에 대해
다음검색